『대당서역기』
K1065
T2087
대당서역기 제4권/전체12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자료출처 불교학술원 기금 후원안내페이지
『대당서역기』
♣1065-004♧
대당서역기 제4권/전체12권
♥아래는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페이지 내용 업데이트 관련 안내]
❋본문
◎[개별논의]
○ [pt op tr]
[#M_▶더보기|◀접기|

○ 2019_1106_115910_nik_BW21_s12

○ 2019_1105_160949_nik_fix

○ 2019_1105_161219_nik_Ab27

○ 2019_1106_121456_can_ct8

○ 2020_0904_092653_can_Ab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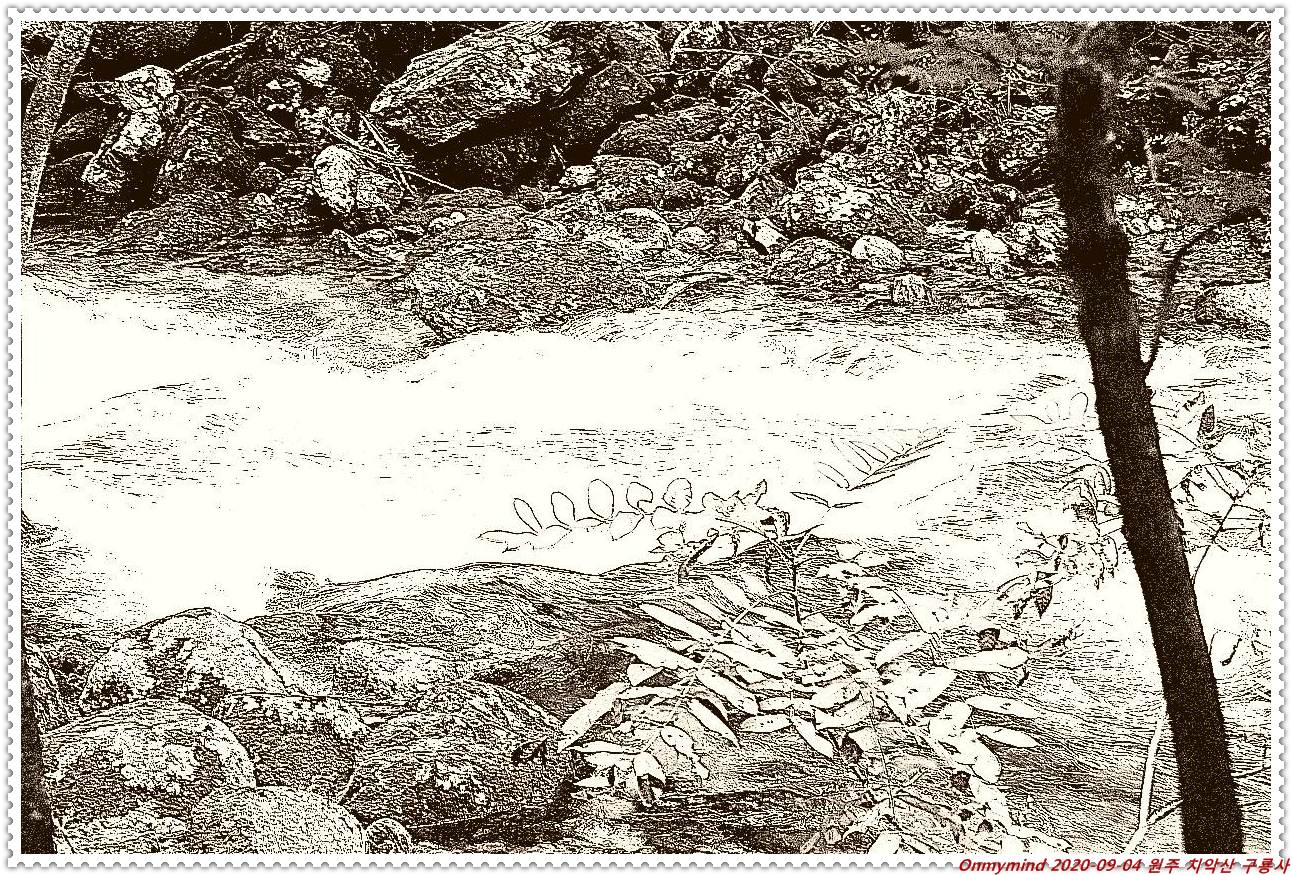
○ 2020_0904_132651_can_BW25

○ 2020_0909_141915_can_CT28

○ 2020_0909_160134_nik_ct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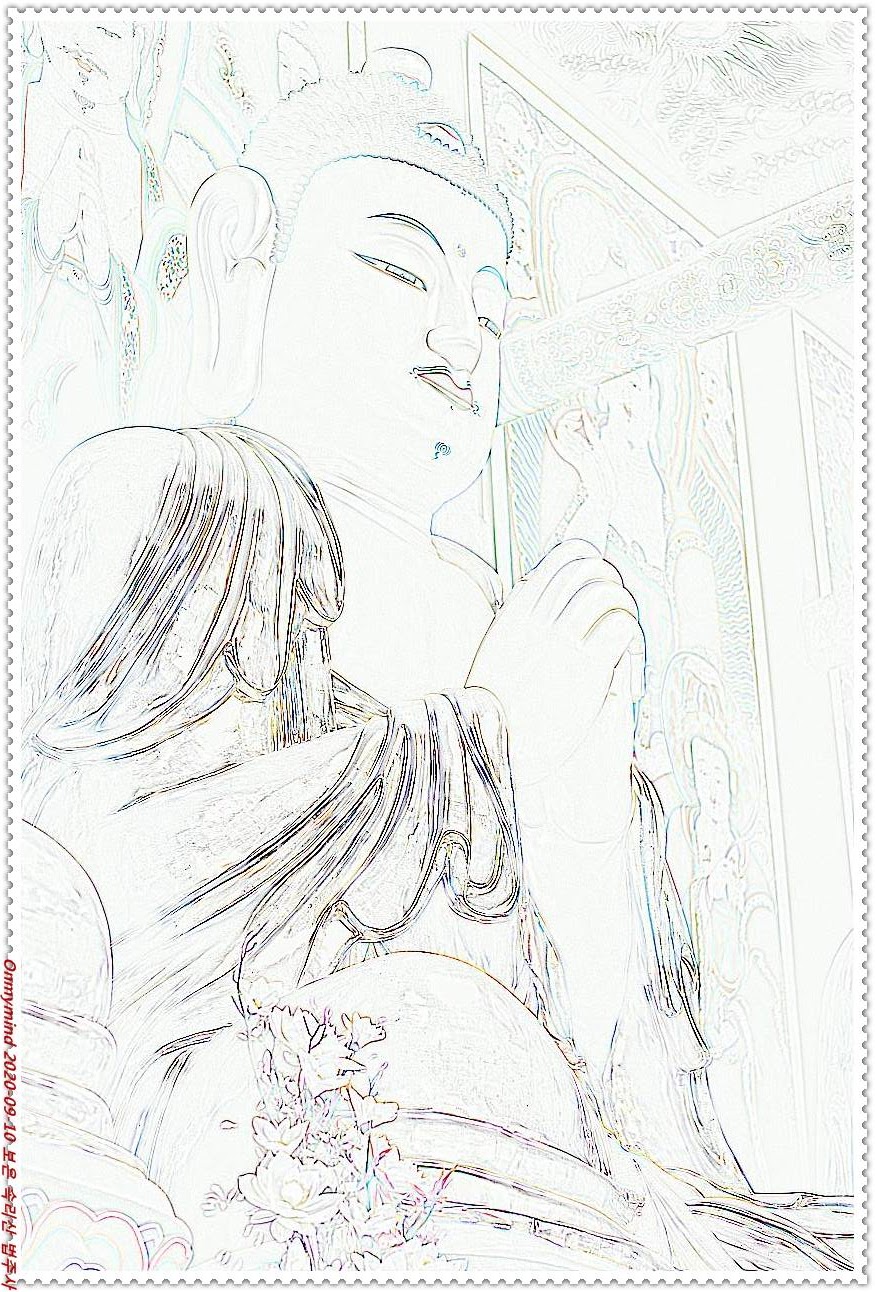
○ 2020_0910_120433_can_ct18

○ 2020_0930_145841_nik_CT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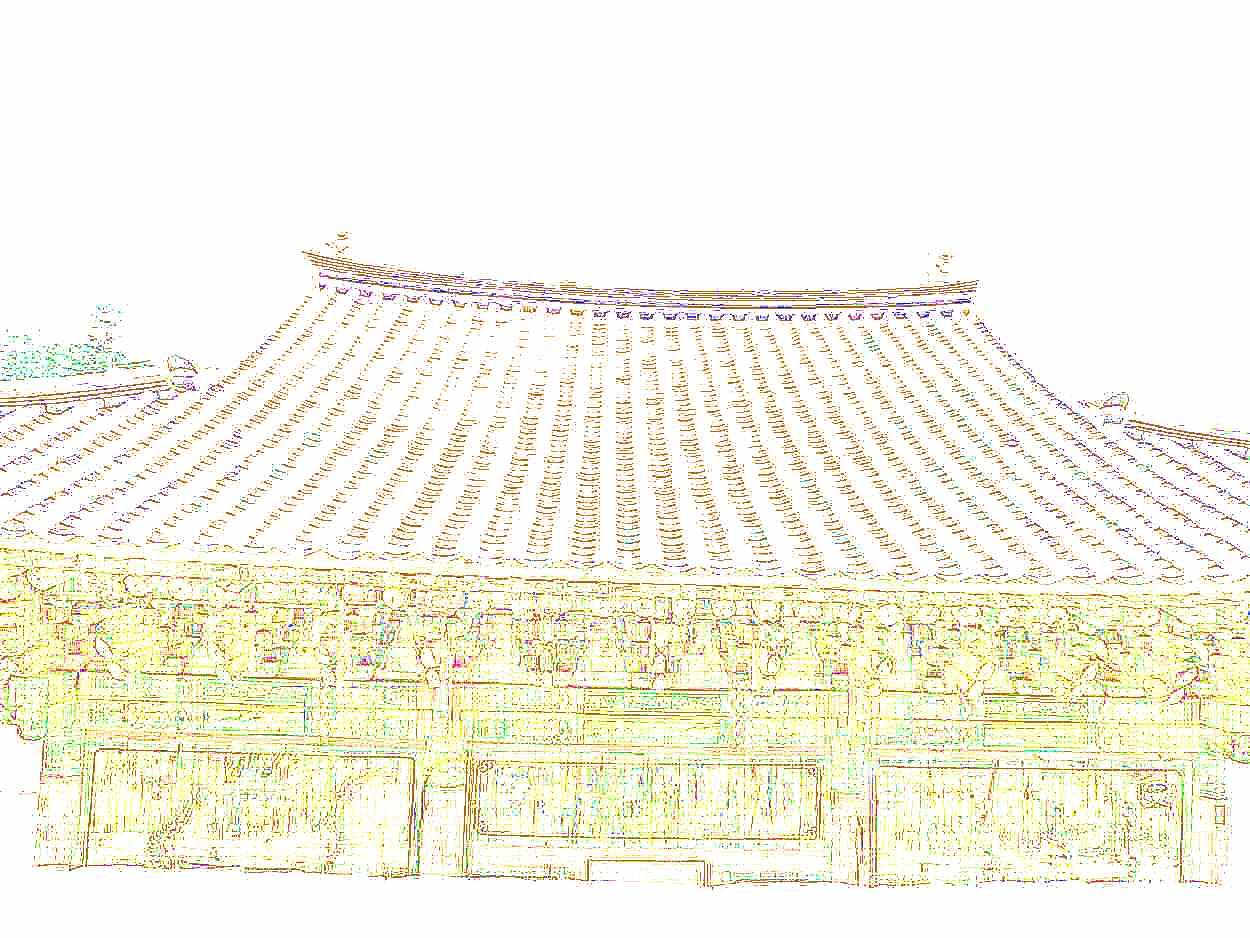
○ 2020_1002_122654_nik_ar38

○ 2020_1017_152730_can_Ab35

○ 2018_1024_140356_can_ct21

○ 2020_1114_132617_nik_ct19

○ 2021_1002_160304_can_ct27_s12_pc영천_만불사

○ 2021_1004_192704_can_BW17_pc여수_금오산_향일암

○ 2304px-Classical_Facade_-_Cordoba_-_Spain_CT27_adapted_from_wiki

○ 2021_1006_144245_nik_CT27_pc해남_달마산_미황사
● [pt op tr] fr
_M#]

○ 2022_0827_143000_nik_ar45_s12의정부_도봉산_회룡사
❋❋본문 ♥ ◎[개별논의]
★%★
『대당서역기』
♣1065-004♧
![]()
◎◎[개별논의] ♥ ❋본문
* 내용 이해가 쉽도록 원 번역문 내용을 단문형태로 끊어 표현을 바꿔 기재한다.
대당서역기 제4권
5. 북인도 중인도[**15개국**]
1) 책가국(磔迦國)**
2) 지나복저국(至那僕底國)
3) 사란달라국(闍爛達羅國)
4) 굴로다국(屈露多國)**
5) 설다도로국(設多圖盧國)
6) 파리야달라국(波理夜呾羅國)
7) 말토라국(秣菟羅國)
8) 살타니습벌라국(薩他泥濕伐羅國)
9) 솔록근나국(窣祿勤那國)
10) 말저보라국(秣底補羅國)
11) 바라흡마보라국(婆羅吸摩補羅國)
12) 구비상나국(瞿毘霜那國)
13) 악혜체달라국(惡醯掣呾邏國)
14) 비라산나국(毘羅刪拏國)
15) 겁비타국(劫比他國)
K1065V32P0397a01L
대당서역기 제4권
현장 한역
변기 찬록
이미령 번역
5. 북인도 중인도[**15개국**]
1) 책가국(磔迦國)**
▪ 책가국1)의 둘레는 만여 리이다.
동쪽으로는 비파사하(毘播奢河)2)에 의거해 있다.
[ Beas강 상류 ]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서쪽으로는 신도하3)에 접해 있다.
[Chenāb강]
https://www.google.co.kr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메벼가 잘 자란다.
그리고 보리가 많이 난다.
그리고 금은과 유석(鍮石), 구리와 쇠가 난다.
기후는 매우 덥다.
그리고 거센 회오리바람이 많이 분다.
풍속은 거칠고 난폭하다.
그리고 말씨는 천박하고 무례하다.
옷은 순백색의 옷을 입는다.
이는 교사야의(憍奢耶衣), 조하의(朝霞衣) 등으로 불리운다.
부처님의 법을 믿는 자는 적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천신(天神)을 섬긴다.
가람은 열 곳 있다.
하지만 천사(天祠)는 수백 곳이 있다.
이 나라에는 예로부터 많은 복사(福舍)4)가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
그런데, 약이나 음식을 베풀기도 하는 등 식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불편함이 없다.
¶▪ 큰 성의 서남쪽으로 14~15리를 간다.
그러다 보면 사갈라(奢羯羅) 옛 성5)에 이르게 된다.
[Śiālkoṭ]
https://www.google.co.kr
담장은 이미 허물어졌다.
하지만 기초는 여전히 튼튼하게 남아있다.
둘레는 20여 리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작은 성을 쌓았다.
그런데 둘레가 6~7리 된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롭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이 나라의 옛 도읍지였다.
수백 년 전에 마혜라구라(摩醯邏矩羅)6)[**당나라 말로는 대족(大族)이라고 한다**]라는 왕이 있었다.
그가 이 성을 통치한다.
그러면서 인도 여러 나라들의 왕이 되었다.
지혜롭고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성품은 용맹하고 장렬하다.
인근 여러 나라들 가운데
굴복하여 신하가 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그는 국사가 잠시 한가해지자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 덕이 높은 스님을 천거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여러 승도들은 감히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욕심이 적고 무위(無爲)를 행하였다.
그리고 입신출세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박학하고 고명한 자들 중에는
왕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자도 있었다.
이 때 예전에 왕가의 종이었던 자가 있었다.
그런데 출가한 지 이미 오래였다.
그리고, 그의 논리는 청아하였다.
그리고 말은 의미가 풍부하고 명민하였다.
그러므로 대중들이 함께 그를 천거하였다.
그리고 왕의 명을 따르기로 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존경하였다.
그래서 멀리 빼어난 스님을 찾았다.
그런데 대중들이 이런 노예를 천거한다.
그래서 나와 담론하게 하는구나.
무릇 승중(僧中)이라 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명한 자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많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본다.
그러니 어찌 존경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5인도국에 명을 내렸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잇는 것은
모조리 멸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도들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게 하였다.
마갈타국의 파라아질다(婆羅阿迭多)7)[**당나라 말로는 유일(幼日)이라고 한다**]왕은
부처님의 법을 높이 받든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는 대족왕(大族王)이 부당하게 형벌을 남용하고
학정을 자행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영토를 지켰다.
그러면서 공물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자 대족왕은 병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토벌하려고 하였다.
유일왕(幼日王)이 이 소식을 듣고서
여러 신하들에게 고하였다.
“지금 듣자니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한다.
그런데 차마 그 병사들과 싸울 수는 없다.
부디 그대들은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을 용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탓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미천한 몸을 놓아준다면
나는 초야에 숨어살겠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궁을 나갔다.
그리고 푸른 산과 들에 의지하여 살았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왕의 은혜에 감복하여
그를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에 몸을 숨기고 살았다.
그러자 대족왕은 병사를 동생에게 맡겼다.
그리고 바다로 나아가 징벌하게 하였다.
유일왕은 험준한 길목은 지켰다.
그리고 몸이 가벼운 기병(騎兵)들로 하여금
적을 유인하게 하여 전쟁을 벌였다.
그리하여 금북[金鼓]을 한 번 울리니
느닷없이 병사들이 4방에서 일어났다.
마침내 대족왕을 생포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바뀌어진 입장에서 대면하게 되었다.
대족왕은 도를 잃은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옷으로 얼굴을 덮었다.
유일왕은 사자상(師子床)에 앉았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주위를 호위하였다.
이에 신하들에게 명하였다.
그래서 대족에게 일렀다.
“너는 얼굴을 드러내라.
내가 말할 것이 있다.”
대족왕은 답하였다.
“신하와 주군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그리고 원수들이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
원래 좋게 지내온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겠는가?”
두세 번 유일왕이 고하였다.
그러나 대족왕은 끝내 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영을 내렸다.
그리고 그 죄를 헤아리면서 말하였다.
“3보의 복전은 4생의 중생들이 의지하는 바이다.
그런데도 승냥이나 이리처럼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승업(勝業)을 허물어뜨렸다.
그러니, 복이 그대를 돕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 잡힌 신세가 되었다.
너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 너의 죄에 따라
형을 내려야 마땅하겠다.”
이 때 유일왕의 어머니는 두루 아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기억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리고 점을 보는 일에 능통하였다.
그녀는 대족왕(大族王)을 죽일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재빨리 유일왕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대족왕은 생김새가 기이하고
지혜도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전부터 한번 보고 싶었소.”
유일왕이 명을 내려 대족왕을 끌어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궁으로 보냈다.
그러자 유일왕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오오, 대족이여.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세간은 덧없는 법이오.
그리고 영욕(榮辱)은 번갈아 찾아오는 법이오.
나는 그대의 어머니와 같소.
그리고 그대는 나의 아들과 같소.
얼굴을 덮은 옷을 치우고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마디라도 건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자 대족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적국의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 채로 잡힌 포로의 몸이구려.
왕업(王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사(宗祀)가 멸망하였습니다.
위로는 선조의 명령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사람들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위로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땅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흥폐(興廢)는 시기에 따르는 것이오.
그리고 존망(存亡)은 운에 달린 것이오.
마음으로 사물을 제어하십시오.
그러면 얻는 일과 잃는 일이 모두 잊혀질 것이오.
사물로 마음을 제어하십시오.
그러면 비난과 명예가 번갈아 일어나게 될 것이오.
의당 업보의 이치를 믿으시오.
그리고 시기의 추이에 순응하도록 하시오.
옷을 걷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목숨을 보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오.”
대족이 고마워하면서 말하였다.
“구차하고 재주도 없는 몸이 왕업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과 행정이 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붙잡힌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루라도 연명하고 싶습니다.
감히 말씀을 받들어서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에 감사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얼굴을 덮어쓴 옷을 걷고 얼굴을 내밀었다.
왕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대는 스스로를 아끼시오.
그래서 천수를 다 누리시오.
그리고 세상을 마치기를 바라오.”
그리고 나서 유일왕에게 고하였다.
“옛 전적에 잘못을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있소.
그리고 살리기를 좋아하라는 가르침이 있소.
지금의 대족왕은
오래도록 사악한 짓을 하였소.
하지만 아직 그 남은 복이 다하지 않았소.
만일 이 사람을 죽인다면
12년 동안 모든 이들이 굶주려서
안색이 초췌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중흥의 기운이 있다 하여도
끝내 대국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작은 국토만을 가질 뿐이오.”
유일왕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군주를 가엾이 여겼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주었다.
그리고 특별한 예로써 대하였다.
그리고, 그의 남은 병사들을 모두 거두었다.
그리고 호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미처 바다의 섬을 나가기도 전에
대족왕의 동생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하는 수 없이 대족은
왕권을 잃었다.
그리고 산과 들에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북쪽으로 갔다.
그래서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에 투항하였다.
가습미라왕은
매우 돈독한 예로 그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것을 가엾이 여겼다.
그래서 토지를 내려주었다.
세월이 흐르자 대족은
그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습미라왕을 교살하였다.
그 뒤에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 승리의 위력을 몰아서
서쪽으로 진군하였다.
그리고 건타라국(健馱邏國)을 토벌하였다.
그는 군사와 무기를 숨겨서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을 죽였다.
그 뒤 나라의 왕족과 대신들도 모두 주살하였다.
그리고 멸망시켰다.
그리고 탑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무려 1천 6백여 곳의 승가람을 파괴하였다.
죽은 병사 외에도 9억의 사람이 살아 있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 죽여 한 명이라도 남겨 놓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자 건타라국의 신하들이 모두 나아가 간하였다.
“대왕의 위력은
강적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주살한다 하여도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디 저희들을 대신 죽여주십시오.”
왕이 말하였다.
“너희는 불법을 믿었다.
그리고 명복(冥福)을 높이 숭상하였다.
불과(佛果)를 이루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본생담(本生譚)이 있다.
이를 본떠서 나의 악업을 미래세에 전하려고 하는가?
너희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하여
이에 3억에 달하는 명문가의 사람들을 신도하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리고, 3억에 달하는 중류층 사람들을 신도하(信度河)에 빠뜨려서 죽였다.
그리고, 3억의 하층민은 병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에 그 패망한 나라의 전리품을 가지고 세력을 떨쳤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대족은 그 해가 바뀌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때 운무가 자욱하게 끼었다.
그리고 대지가 진동하였다.
그리고 폭풍이 사납게 불어댔다.
과위(果位)를 증득한 사람들은
가엾게 여겼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죄 없는 이를 무고하게 죽였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훼멸하였다.
그러니,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떠도는 일이 끝이 없으리라.”
▪ 사갈라의 옛 성 안에는
가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승도는 백여 명에 달한다.
그들은 모두 소승법을 공부하고 있다.
세친(世親)보살이 옛날 이곳에서
『승의제론(勝義諦論)』을 지었다.
▪ 그 옆에 탑이 있다.
그런데 높이는 2백여 척이다.
과거에 네 분의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법을 설하셨다.
▪ 또 네 부처님이 거니시던 곳의 유적지가 있다.
▪ 가람의 서북쪽으로 5~6리 가면 탑이 있다.
높이는 2백여 척이다.
무우왕(無憂王)이 세운 것이다.
이곳도 과거의 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곳이다.
▪ 새 도성에서
동북쪽으로 10여 리를 간다.
그러다 보면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에 이른다.
높이는 2백여 척이다.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이것은 여래께서
북쪽으로 가셔서
교화하시던 도중에 잠시 멈추신 곳이다.
『인도기(印度記)』8)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솔도파 속에는 많은 사리가 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재일(齋日)에 광명을 발하기도 한다.”
▪ 이곳에서 동쪽으로 5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지나복저국(至那僕底國)[**북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2) 지나복저국(至那僕底國)
▪ 지나복저국9)의 둘레는 2천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4~15리이다.
[Amritsar -> Chiniyari -> Śiālkoṭ ]
https://www.google.co.kr
농사가 매우 번창하다.
하지만 과실나무는 아주 드물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는 매우 풍요롭고 넉넉하다.
기후는 무덥다.
그리고 풍속은 겁약하다.
세속을 벗어나는 진리와 속세의 학업을 함께 배우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과 삿된 가르침을 겸하여 믿고 있다.
가람은 10곳 있다.
그리고 천사는 8곳 있다.10)
¶옛날 가니색가왕(迦膩色迦王) 치세 시절에
그 명성은 주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위엄은 모든 외국에 두루 퍼져 있었다.
강 서쪽에 살고 있는 오랑캐들이 왕의 위엄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인질을 보내왔다.
가니색가왕은 인질[質子]을 얻게 되면
후하게 그를 대접하였다.
그리고 세 계절에 맞추어 관저를 옮겨가 살게 하였다.
그리고 4병(兵)으로 하여금 경호하게 하였다.
이 나라는 인질이 겨울에 머물던 곳이었다.
때문에 지나복저(至那僕底)[**당나라 말로는 한봉(漢封)이라고 한다**]라고 부른다.
인질이 머문 것이 이 나라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본래 이 국토에서부터 여러 인도에 이르기까지
배와 복숭아가 없었다.
그런데 인질이 그 종자를 가져와 심었다.
그러므로 복숭아를 지나이(至那爾)[**당나라 말로는 한지래(漢持來)라고 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배를 지나라사불달라(至那羅闍弗呾邏)[**당나라 말로는 한왕자(漢王子)라고 한다**]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나라 사람들은 동쪽 나라를 깊이 존경하여 왔다.
그리고, 곧 서로 나(현장)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선왕(先王)의 본국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 큰 성의 동남쪽으로 5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답말소벌나(答秣蘇伐那)11)[**당나라 말로는 암림(闇林)이라고 한다**]승가람에 이른다.
[Amritsar ->-> Sultānpur ]
https://www.google.co.kr
승도는 3백여 명 살고 있다.
그리고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승도들의 위의는 온화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그리고 덕행이 맑고 고고하다.
그들은 특히 소승의 학문을 널리 연구하고 있다.
현겁(賢劫)의 천불(千佛)이 모두 이곳에 하늘과 인간 대중들을 모아 놓고 미묘하고
깊은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 석가여래께서 열반하신 후 3백 년째 되던 해에
가다연나(迦多衍那)12)[**구역에서는 가전연(迦旃延)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논사가
이곳에서 『발지론(發智論)』13)을 지었다.
▪ 암림가람 속에는 솔도파가 있다.
그런데 높이는 2백여 척이다.
이는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 그 옆에는 바로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 작은 솔도파와 커다란 석실들이 고기비늘처럼 쭉 늘어서 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런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들은 겁초 이래 모든 과위를 얻은 성인들이 여기에서
적멸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들쭉날쭉한 것이 일일이 들어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치아와 뼈는 지금도 안치되어 있다.
▪ 산을 두르고 있는 가람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부처님의 사리탑은 수백 수천여 기가 있다.
그런데, 모서리가 서로 연이어 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잇달아 있을 정도로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40~150리를 간다.
그러다 보면 사란달라국(闍爛達羅國)[**북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3) 사란달라국(闍爛達羅國)
▪ 사란달라국14)은 동서로 천여 리이다.
[ Amritsar -> Jullundur(Jalandhar)]
https://www.google.co.kr
남북으로 8백여 리에 달한다.
그리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2~13리이다.
곡식 농사가 잘 된다.
그리고 메벼가 많이 난다.
숲에는 나무가 울창하다.
그리고 꽃과 과일이 무성하다.
기후는 덥다.
그리고 풍속은 강렬하다.
생김새는 비루하다.
하지만 집들은 풍요롭다.
가람은 50여 곳 있다.
그리고 승도의 수는 2천여 명 있다.
그런데, 대ㆍ소승을 전문적으로 익히고 배우고 있다.
천사(天祠)가 세 곳 있다.
그리고 외도는 5백여 명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재를 몸에 바르는 외도들이다.
이 나라 선왕(先王)은 외도를 숭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라한을 만났다.
그리고 법을 들었다.
그리고 진리를 믿고 깨치게 되었다.
그러자 중인도의 왕이 그의 신앙의 돈독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5인도국의 3보에 관계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는 편을 가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를 총애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승도들을 감독하였다.
그래서 규율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선과 악을 세심하게 밝혀내었다.
도와 덕이 뛰어났다.
그래서 명성이 높은 자는 진심으로 우러르고 존경하였다.
그리고, 계행에 어긋나고 범하는 자는 무거운 벌을 내렸다.
또한 부처님의 자취가 있는 곳에는 모두 다 표식을 해두었다.
그래서 솔도파를 세웠다.
또는 승가람을 지었다.
그래서 인도의 경계 안에 두루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향하여 험한 고개를 넘는다.
그리고 깊은 계곡을 지난다.
그래서 위태로운 길을 지난다.15)
[ Beas강 상류 ]
https://www.google.co.kr
그래서 7백여 리를 간다.
그러다 보면 굴로다국(屈[居勿反]露多國)[**북인도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
¶¶
¶4) 굴로다국(屈露多國)**
▪ 굴로다국16)의 둘레는 3천여 리이며 산이 4방으로 에워싸고 있다.
[지금의 Kaṅgra의 Kulū 지방, ]
https://www.google.co.kr
나라의 큰 도성17)의 둘레는 14~15리이다.
[Amritsar ->-> Sultānpur ]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토지는 비옥하다.
그리고 때맞추어 곡식을 파종한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
그리고 초목이 우거졌다.
설산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진귀한 약초가 많이 난다.
그리고, 금은과 적동(赤銅)과 화주(火珠)ㆍ우석(雨石)18)이 난다.
기후는 점점 추워진다.
그리고 눈과 서리가 조금 내린다.
사람들의 생김새는 추하다.
그리고 목에 혹이 있다.
그런데다가 다리 또한 부어있다.
성품은 강인하다.
그리고 용맹하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를 숭상한다.
가람은 20여 곳 있다.
그리고 승도는 천여 명 있다.
대부분 대승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각 부파들의 사상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열다섯 곳이 있다.
그리고 이도(異道)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큰 바위와 산마루에 의거하여
석실들이 서로 간격을 두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아라한이 살았던 곳이다.
그리고 어떤 곳은 선인이 머물렀던 곳이다.
나라 안에 있는 솔도파는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유적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 여래께서 일찍이 이 나라에 오셨다.
그래서 널리 법을 설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도하셨다.
▪ 이곳에서 북쪽 길을 따라서
1,800~1,900리의 길을 간다.
그런데, 길은 험하다.
그리고 산과 계곡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 낙호라국(洛護羅國)19)에 이른다.
[Kaṅgra ]
https://www.google.co.kr
▪ 여기서 북으로 2천여 리를 간다.
그런데, 험난한 길을 지난다.
그리고 찬바람을 이겨내고 눈이 날리는 길을 지난다.
그러면 말라사국(秣邏娑國)20)[**또는 삼파가국(三波訶國)이라고도 부른다**]에 이른다.
▪ 굴로다국으로부터 남쪽으로 7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큰 산을 넘고 큰 강을 지난다.
그리고 설다도로국(設多圖盧國)[**북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5) 설다도로국(設多圖盧國)
▪ 설다도로국21)의 둘레는 2천여 리이다.
[Kaṅgra -> Sutlej, Satlej 강]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서쪽은 큰 강에 접해 있다.
나라의 큰 도성22)의 둘레는 17~18리이다.
[ Sutlej, Satlej 강 ->Sarhind ]
https://www.google.co.kr
곡식은 매우 풍성하다.
그리고 과실이 매우 많다.
금과 은이 많이 난다.
그리고 진주도 산출된다.
복장은 새하얀 색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치마[裳衣]는 아름답고 화려하다.
날씨는 무덥다.
그리고 풍속은 순박하고 온화하다.
사람들의 성품도 선량하고 순하다.
그리고 위아래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불법을 독실하게 믿는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다.
왕성의 안팎에 가람이 열 곳 있다.
그런데 건물은 폐허가 되어 황량하다.
그리고 승도는 매우 적다.
▪ 성의 동남쪽으로 3~4리 떨어진 곳에 솔도파가 있다.
그런데, 높이는 2백여 척에 달한다.
이는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 그 옆에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 또다시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8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파리야달라국(波理夜呾囉國)[**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6) 파리야달라국(波理夜呾羅國)
▪ 파리야달라국23)의 둘레는 3천여 리이다.
[Bairāt, Vairāṭa ]
https://www.google.co.kr
나라의 큰 도성24)의 둘레는 14~15리이다.
[Bairāt, Vairāṭa ]
https://www.google.co.kr
곡식이 잘 자란다.
그리고 보리가 많이 난다.
씨 뿌린 지 60일이 지나면
수확을 하는 기이한 벼도 있다.
소와 양이 많다.
그리고 꽃과 열매가 적다.
그리고, 날씨는 무덥다.
그리고 풍속은 강인하고 용맹스럽다.25)
학예를 숭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도를 신봉한다.
왕은 폐사(吠奢) 종족이다.
성품은 용감하고 맹렬하다.
그리고 무예와 지략에 밝다.
가람26)은 여덟 곳이 있다.
그런데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태가 심하다.
승도는 아주 적다.
그런데 그들은 소승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10여 곳 있다.
그리고 이교도가 천여 명 있다.
▪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5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말토라국(秣菟羅國)[**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7) 말토라국(秣菟羅國)
▪ 말토라국27)의 둘레는 5천여 리이다.
[Bairāt, Vairāṭa -> Mathura]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다.
그리고 농사짓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집집마다 암몰라과(菴沒羅菓)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나무는 비록 이름은 한 가지로 같다.
하지만 두 종류가 있다.
작은 것은 처음 생겨날 때에는 파란색이다.
그러다가 익으면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색이다.
가는 반점이 있는 모직물과 황금이 난다.
기후는 무덥다.
그리고 풍속은 선하고 순박하다.
내세의 복을 빌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덕과 학문을 숭상한다.
가람은 20여 곳 있다.
승도는 2천여 명 있다.
대ㆍ소승을 겸하여 익히고 있다.
천사(天祠)는 다섯 곳이 있다.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솔도파가 셋 있다.
그런데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과거 네 분의 부처님의 유적이 참으로 많다.
석가여래와 여러 성제자의 유신(遺身) 솔도파,
이른바 사리자(舍利子)[**구역에서는 사리자(舍梨子) 또는 사리불(舍利佛)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몰특가라자(沒特伽羅子)[**구역에서는 목건련(目犍連)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포라나매달려연니불달라(布剌拏梅呾麗衍尼弗呾羅)28)[**당나라 말로는 만자자(滿慈子)라고 하며 구역에서는 미다라니자(彌多羅尼子)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오바리(鄔波釐),
아난타(阿難陀),
라호라(羅怙羅)[**구역에서는 라후라(羅候羅)라고 하거나 라운(羅云)이라고 하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와,
만수실리(曼殊室利)[**당나라 말로는 묘길상(妙吉祥)이라고 하는데 구역에서는 유수(濡首), 또는 문수사리(文殊師利), 혹은 만수시리(曼殊尸利)라고 하며 번역하여 묘덕(妙德)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등
여러 보살의 솔도파 등이 있다.
매년 3장재월(三長齋月)29),
그리고 매달 6재일(齋日)에는30)
승도들이 앞다투어 도반들과 함께 공양거리를 가지고 재를 올린다.
그리고 신기한 노리개를 많이 매단다.
그리고 각기 모시는 바를 따라서
해당하는 상 앞에 재단을 차린다.
그런데 아비달마(阿毘達磨) 대중들은 사리자를 공양한다.
그리고, 정(定)을 익히는 무리들은 몰특가라자(沒特伽羅子)에게 공양한다.
그리고, 경을 지송하는 자들은 만자자(滿慈子)를 공양한다.
그리고, 비나야(毘奈耶)를 익히는 무리들은 오파리(鄔波釐)를 공양한다.
그리고, 모든 필추니(苾蒭尼:비구니)들은 아난을 공양한다.
그리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들은 라호라를 공양한다.
그리고, 대승을 배우는 자들은 보살들을 공양한다.
이 날에는 모든 솔도파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공양을 받게 된다.
그런데 구슬을 매단 번(幡)이 줄지어 선다.
그리고 보배 덮개가 나란히 늘어선다.
향 연기가 구름처럼 자욱하다.
그리고 꽃이 비처럼 흩뿌려진다.
그러니 해와 달이 가려져 빛을 잃는다.
그리고 계곡이 뒤흔들릴 정도이다.
국왕과 대신들은 선(善)을 닦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31)
▪ 성의 동쪽으로 5~6리 간다.
그러면 어떤 산의 가람32)에 이른다.
이는 벼랑이 탁 트인 곳을 집으로 삼았다.
그리고 계곡을 문으로 삼았다.
존자 오파국다(鄔波鞠多)33)[**당나라 말로는 근호(近護)라고 한다**]가 세운 것이다.
그 안에는 여래의 손톱이 들어 있는 솔도파가 있다.
▪ 가람의 북쪽 암벽 사이에 석실이 있다.
그런데 높이가 20여 척이다.
그리고 너비가 30여 척에 달한다.
그리고 4촌(寸)의 가는 대막대기들이 그 속에 가득 쌓여있다.
근호 존자(近護尊者)가 부부에게 설법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였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아라한을 증득하면
곧 대가지 하나를 아래로 내려놓았던 곳이다.
가족이 아닌 경우는 비록 과위를 증득했더라도 표기하지 않았다.34)
▪ 석실의 동남쪽으로 24~25리 간다.
그러다 보면 물이 고갈된 커다란 못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곁에는 솔도파가 있다.
옛날 여래께서 이곳을 거쳐 가셨다.
그 때 어떤 원숭이가 꿀을 가져다 부처님께 올렸다.35)
부처님께서는 물을 타서 묽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중들이 모두 마실 수 있게 하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원숭이가 기뻐서 뛰었다.
그러다가 구덩이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런데, 이 복의 힘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연못의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숲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과거 네 부처님이 거니시던 유적이 있다.
그 옆에는 사리자와 몰특가라자 등 1천 250명의 대아라한들이 선정을 닦던 곳이 있다.
이 모든 것에 솔도파를 세웠다.
그래서 유적으로 표시해 두었다.
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나라에 노니시며 설법하신 곳이 있다.
이 곳에는 모두 봉수(封樹)36)가 있다.
▪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5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살타니습벌라국(薩他泥濕伐羅國)[**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8) 살타니습벌라국(薩他泥濕伐羅國)
▪ 살타니습벌라국37)의 둘레는 7천여 리이다.
[Mathura ->Thānesar]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다.
그리고 농사가 번창하다.
기후는 무덥다.
그리고 풍속은 경박하다.
집들은 풍요롭다.
그리고 사치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다.
환술(幻術)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기이한 능력을 높이 숭상한다.
많은 이들이 장사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4방의 온갖 기이한 재화들이 이 나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가람은 세 곳이 있다.
그리고 승도는 7백여 명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백여 곳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은 매우 많다.
큰 성의 4방 2백 리 안의 지역은
그 나라 사람들이 복지(福地)38)라고 일컫는 땅이다.
그런데 옛 선현들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39)
옛날 5인도국을 두 왕이 나누어 통치하였다.
두 왕은 상대방의 국경을 번갈아 침략하였다.
그러면서 쉼 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두 군주들은 함께 합의하였다.
그래서 전쟁을 결판 짓고 이로써
자웅(雌雄)을 가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도모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다 원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왕의 명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백성이라는 것은 더불어 일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존재이다.
불가사의한 것[神]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방편[權]은 공(功)을 이룰 수 있다’
이 때 세상에는 한 범지(梵志)가 있었다.
그는 덕이 높고 재주가 뛰어났다.
그래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왕은 은밀히 예물을 보냈다.
그래서 그를 궁의 뒤뜰로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법서(法書)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 동굴 속에 숨기게 하였다.
세월이 오래 지나자 나무들이 서로 동굴을 뒤덮었다.
그러자 왕이 조정에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머물러 있었다.
천제께서 빛을 내리시었다.
그래서 꿈에 신령스러운 책을 보내주셨다.
지금 그 책이 어떤 산 어떤 고개에 숨겨져 있다.”
그리하여 영을 내려 찾아오게 하였다.
그러자 산림 속에서 책을 찾아내었다.
관리들이 경사로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쁨에 들떴다.
그리하여 4방에 포고를 내려 널리 알렸다.
그런데 그 대충의 내용은 이러하다.
“무릇 생사는 끝이 없다.
그리고 유전(流轉)은 다함이 없다.
그러니, 중생들은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나는 어떤 꾀를 내어서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
지금의 이 왕성의 둘레 2백 리는 예로부터 선조이신 제왕들께서
세간의 복리를 위해 일군 땅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나도 많이 흘렀다.
그래서 그것의 기록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중생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의 바다에 빠졌다.
그리고 물에 빠졌으되 구제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 어찌할 것인가?
그대 중생들이여,
적의 병사들과 대적하다 죽음을 당한다고 하자.
그러면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을 많이 죽여도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복락을 받을 것이다.
효손, 효자들이 어버이와 노인을 부축하면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러면 얻게 되는 복이 무궁할 것이다.
적게 공을 들여서 많은 복을 얻는다고 하자.
그러면 어찌 이런 이익을 놓치겠는가?
한번 사람의 몸을 잃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3도(途)의 암흑 속에서 헤매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각자 힘써 업을 닦아야 한다.
이에 사람들은 전투술을 익혔다.,
그래서 죽음을 보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게 되었다.
왕은 마침내 영(令)을 내렸다.
그래서 용맹한 병사들을 모았다.
그리하여 두 나라가 함께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 시체가 쌓이는 것이
마치 풀숲을 이룬 것과 같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해들이 들판에 널려져 있다.
이미 오래 전 옛날의 일이다.
그러나 그 유골들이 하도 엄청났다.
때문에 나라의 풍속에서는
이것을 복지(福地)라고 부른다.
그리고 서로 전해오고 있다.
▪ 성의 서북쪽으로 4~5리를 간다.
그러다 보면 솔도파가 있다.
그런데 높이는 2백여 척에 달한다.
이는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벽돌은 모두 황적색이다.
그런데 매우 광택이 난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 속에 여래의 사리가 한 되 들어 있다.
그런데 때로 광명이 비친다.
그리고 신이로운 기적이 끊이지 않는다.
▪ 성의 남쪽으로 백여 리를 간다.
그러다 보면 구혼다(俱昏[去聲]茶) 승가람에 이른다.
중각(重閣)의 용마루가 이어졌다.
그리고 층대(層臺)가 사이사이마다 높이 솟아있다.
승도들은 청정하고 엄숙하다.
그리고 위의가 조용하다.
그리고 단아하다.
▪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4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솔록근나국(窣祿勤那國)[**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9) 솔록근나국(窣祿勤那國)
▪ 솔록근나국40)의 둘레는 6천여 리이다.
[Thānesar -> Dehra Dun지방의 Kālsi에 가까운 Sugh]
https://www.google.co.kr
그런데 동쪽으로는 긍가하(殑伽河)에 닿아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큰 산을 등지고 있다.
염모나하(閻牟那河)41)가 국토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Dehra Dun지방 -> yamunā, 또는 Jumnā 강 ]
https://www.google.co.kr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염모나하에 접해 있다.
그런데 황폐한 상태가 심하다.
하지만 그 기초는 아직까지 튼튼하다.
토지의 산물이나 풍토와 기후는 살타니습벌라국과 같다.
사람들의 성품은 순박하다.
그리고 외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
기예와 학문을 귀히 여긴다.
그리고 복덕과 지혜를 높이 산다.
가람은 다섯 곳 있다.
그리고 승도는 천여 명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승을 배운다.
그리고 소수의 승도들은 다른 부파를 배우고 있다.
미묘한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현묘한 이치를 맑게 논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빼어난 인재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의심나는 것을 논한다.
천사(天祠)는 백 곳이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아주 많다.42)
▪ 큰 성의 동남쪽 염모나하의 서쪽에 큰 가람이 위치한다.
이 가람의 동문(東門) 밖에 솔도파가 있다.
이는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일찍이 이곳에서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화하신 곳이다.
그 곁에 솔도파가 또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다.
사리자와 몰특가라와 여러 아라한의 머리털과 손톱이 들어 있는 솔도파가
그 좌우에 수십여 곳 빙 둘러 세워져 있다.
여래께서 적멸하신 후 이 나라는 여러 외도들로 인해 미혹에 빠졌다.
그리고 삿된 법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훼손하였다.
지금은 가람이 다섯 곳 있다.
다른 나라의 논사들이 여러 외도나 바라문들과 함께 논쟁을 벌여서 이긴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려서 세운 것이다.
▪ 염모나하의 동쪽으로 8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긍가하에 이른다.
그런데 강의 원천은 너비가 3~4리 된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바다로 유입되는 곳은 너비가 10여 리 된다.
물의 색은 새파랗다.
그리고 그 물결은 광대하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해(害)를 끼치는 일은 없다.
물맛은 달콤하다.
그리고, 고운 모래가 함께 흘러간다.
이 나라 토속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복덕이 있는 물[福水]이라고 부른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이 물에 목욕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스스로 몸을 이 물에 던지면
하늘에 태어나 복을 받는다.
죽은 자의 해골을 던지면 악취(惡趣)43)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물을 떠올렸다가 흘려 보내면 죽은 자의 혼이 구제를 얻는다고 한다.
당시 집사자국(執師子國)44)의 제바(提婆)보살45)이 실상(實相)에 깊이 도달하였다.
그래서 모든 법성(法性)을 얻었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들을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였다.
그 때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래서 강가에서 물을 떠올렸다가 흘려보내고 있었다.
제바보살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물을 퍼 올렸다.
그런데 머리를 숙이고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사람들과 달랐다.
그러므로 외도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들과 달리하는 것이오?”
제바보살이 말하였다.
“나의 부모와 친족들은 집사자국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굶주리고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도들이 말하였다.
“그대는 틀렸습니다.
어찌하여 거듭 생각해보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망령되게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대의 고국산천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강물을 떠올림으로써 그들의 기갈을 구제해준다는 말은
마치 뒷걸음질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일이오.”
그러자 제바보살이 말하였다.
“유도(幽途)46)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도
이 물에서 씻긴다고 합니다.
그러거늘 산천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어떻게 구제받지 못하겠소?”
그러자 외도들은 제바보살을 상대로 대론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사죄하였다.
그리고 삿된 견해를 버렸다.
그리고 바른 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허물을 씻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들기를 원하였다.
▪ 이 강을 건너서 동안(東岸)으로 간다.
그러다 보면 말저보라국(秣底補羅國)[**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10) 말저보라국(秣底補羅國)
▪ 말저보라국47)의 둘레는 6천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곡식이 잘 자란다.
그리고 꽃과 과일이 많다.
기후는 온화하다.
그리고 맑다.
그리고 풍속은 순박하다.
학예를 높이 숭상한다.
그리고 주술에 깊이 빠져 있다.
삿된 법과 올바른 법을 믿는 자들의 숫자는 반반이다.
왕은 수다라종(戍陀羅種)48)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천신(天神)을 섬기고 받든다.
가람은 10여 곳 있다.
그리고 승도들은 8백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유부를 배우고 있다.
천사는 50여 곳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49)
▪ 큰 성의 남쪽으로 4~5리 간다.
그러다 보면 작은 가람에 이른다.
승도들은 50여 명 있다.
옛날 구나발라바(瞿拏鉢剌婆)[**당나라 말로는 덕광(德光)이라고 한다**]논사가 이곳에서
『변진론(辯眞論)』 등을 지었다.
그런데 이 논서는 약 백여 부에 달한다.
논사는 어려서는 빼어난 준걸이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서부터는 명민하였다.
그리고 박학다식하였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았다.
그는 보고 들은 것이 많은 훌륭한 학자였다.
그는 본래는 대승을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대승의 현묘하고 깊은 이치를 꿰뚫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로 말미암아 『비바사론』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업인 대승을 물리쳤다.
그리고 소승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수십 부의 논서를 지었다.
그래서 대승의 기강을 논파하였다.
그리고 소승에 집착하게 되었다.
또한 통속적인 저서 수십여 부를 지었다.
그래서 선배들이 지은 논전(論典)을 비난하였다.
어느 날 불경을 깊이 사색하였다.
그러다가 10여 가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래도록 쉬지 않고 사색하여 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이 때 제바서나(提婆犀那)50)[**당나라 말로는 천군(天軍)이라고 한다**]나한이 도사다천(覩史多天)을 오가고 있었다.
덕광은 미륵보살[慈氏]을 만났다.
그래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천군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천군은 신통력으로 그를 천궁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길게 읍할 뿐 절을 하지 않았다.
천군이 물었다.
“자씨보살은 다음에 부처님의 지위에 오를 분이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교만을 부리며 경례하지 않는 것인가?
그대는 지금 배우기를 원하면서
어찌하여 굽히지 않는다는 말인가?”
덕광이 대답하였다.
“존자의 말씀이 참다운 가르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족계를 받은 필추로서 출가 제자입니다.
자씨보살은 하늘의 복락을 누립니다.
하지만 출가 승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올리고 싶어도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자씨보살은 그가 자만심[我慢心]이 대단하여
법을 들을 그릇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덕광은 세 번 오갔다.
하지만 의심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천군에게
자씨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천군은 그의 자만심을 곱지 않게 보았다.
그리고 멸시하여 상대하지 않았다.
덕광은 더 이상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곧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곧 숲으로 가서 신통력의 선정을 닦았다.
하지만 자만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도과(道果)51)를 증득하지 못하였다.
▪ 덕광의 가람에서 북쪽으로 3~4리 떨어진 곳에 큰 가람이 있다.
승도는 2백여 명이다.
그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이곳은 중현(衆賢)논사가 목숨을 마친 곳이다.
논사는 가습미라국 사람이었다.
총명하고 영리하였다.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특히 설일체유부의 『비바사론』을 깊이 연구하였다.
한편 당시 세친보살은 일심으로 깊은 도를 닦았다.
그래서 언외(言外)의 진리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비바사 논사들의 견해를 타파하여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52)을 지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분명하고 능숙하였다.
그리고 이치는 정묘하고 숭고하였다.
중현이 곧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각하는 바가 있게 되었다.
이에 깊이 연찬하여 12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 뒤에 『구사박론(俱舍雹論)』2만 5천 송(頌)을 지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려 80만 어(語)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른바 그 말에 깊이가 있고 지극한 이치에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그윽하고 미묘한 이치에 환히 통달한 것이었다.
그는 문인들에게 고하였다.
“나의 빼어난 재주와 정론(正論)으로써
세친을 배척하리라.
그리고 그의 예봉을 꺾어놓으리라.
그리고, 그 늙은이로 하여금
제멋대로 첫째간다는 명성[先名]을 날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에 수하의 문하생들 가운데
3~4명의 영재들과 함께
자신이 지은 논서를 들고 세친을 찾아갔다.
세친은 이 때 책가국(磔迦國) 사갈라성(奢羯羅城)에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중현이 장차 이곳에 올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들었다.
세친은 이 소문을 듣자 곧 행장을 꾸렸다.
그러자 문인들이 의아해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간하였다.
“대사께서는 덕이 높고 으뜸가는 철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당대에 널리 날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곳의 학도들마다 추앙하며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제 중현의 소식을 들으시고
어찌하여 갑자기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당황해 하십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세친이 말하였다.
“내가 지금 멀리 나들이를 가는 것은
그 사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살펴보건대 견식이 있고 통달한 자는 더 이상 없다.
중현은 후배이다.
하지만 말솜씨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창하다.
나는 이미 노쇠하였다.
그러므로 논쟁을 지속할 수 없다.
한 마디 말로써 그의 다른 견해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때문에 중인도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뛰어난 인사들 앞에서 그 진위를 살피고자 한다.
그래서 득실을 자세하게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반에게 책 상자를 짊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따라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멀리 외유를 나갔다.
중현 논사는 하루 늦게 이 가람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홀연히 기운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에 세친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사죄하며 말하였다.
“여래께서 적멸하신 뒤에 제자들이 부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견해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들 종파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각기 그 학문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길을 가는 이들끼리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파들을 질시하였습니다.
저는 어리석읍니다.
그런데도 외람되게 전습(傳習)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다 보살께서 지으신 『아비달마구사론』이 비바사 논사들의 대의를 논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문득 제 힘을 헤아리지 못한 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보내다 이 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종파의 학문을 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작고 꾀가 컸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장차 임박했습니다.
보살께서는 미묘한 말씀을 널리 펼치고 지극한 이치를 높이 드날리고 계십니다.
만일 저의 견해를 무너뜨리지 않으시어
제 글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진실로 다행입니다.
그러면 죽는다 해도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이에 문하의 사람들 가운데
말솜씨가 뛰어난 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고하였다.
“내가 참으로 후학이면서도
선현들을 경멸하고 능멸하려 하였구나.
운명이니 어찌하겠는가?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편지와 내가 지은 논을
저 보살에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죄하고
내 대신 허물을 참회하여라.”
이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홀연히 숨을 거두었다.
문하의 사람이 편지를 받들었다.
그리고 세친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하였다.
“저의 스승이신 중현은 이미 수명을 마치셨습니다.
유언으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허물을 책하셨습니다.
스승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감히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친 보살은 편지를 읽고 논(論)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깊이 오래도록 탄식하였다.
그리고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중현 논사는 총명한 후배이다.
이치는 비록 두루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언사는 넉넉하다.
내가 지금 중현의 논을 논파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목숨을 마치려 할 때의 유언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의 어려운 문제를 아는 언사[知難之辭]를 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적어도 대의(大義)에 연하여
그가 품었던 뜻[宿志]을 보존시켜야겠다.
하물며 이 논은 나의 종파를 밝게 드러냄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마침내 제목을 고쳤다.
그리고 『순정리론(順正理論)』53)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문하의 사람이 간언하였다.
“중현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대사께서는 먼 곳에 계셨습니다.
이제 이 논을 얻고서 다시 제목을 고치십니다.
그러니 이제 학도들은
어떤 낯으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세친 보살이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여
게송을 설하였다.
∞
사자의 왕이 돼지를 피하여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두 장수의 승부를 지혜로운 자는 응당 안다.
∞∞
중현이 죽고 난 뒤에 시신을 다비하였다.
그리고 뼈를 가람에 거두었다.
서북쪽으로 2백 걸음을 걸어간다.
그러다 보면
암몰라림 속에 솔도파를 세웠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다.
▪ 암몰라림 옆에 솔도파가 있다.
그런데 비말라밀다라(毘末羅蜜多羅)54)[**당나라 말로는 무구우(無垢友)라고 한다**] 논사의 유해가 있다.
논사는 가습미라국 사람이다.
설일체유부파로 출가하였다.
널리 뭇 경을 두루 읽었다.
그리고 다른 논서들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5인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3장의 깊은 문장을 배웠다.
마침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학업이 성취되었다.
그러자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다 중현 논사의 솔도파를 지나게 되었다.
그는 솔도파를 어루만지며 탄식하여 말했다.
“생각건대 논사는 마음이 너그럽고 올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청정하고 고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높이 드날리셨습니다.
다른 부파를 꺾고 자신의 종파의 학업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이 내린 수명은 그토록 짧았단 말입니까?
나 무구우는 외람되게도 말학(末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뜻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오래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세친도 비록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파의 학문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다 동원하여
여러 논서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부주의 모든 학인들에게 있어
대승이라는 호칭이 끊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친이라는 이름이 멸절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불후의 논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숙심(宿心)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이내 마음은 광란(狂亂)하게 되었다.
그리고 혀가 다섯 갈래로 갈라졌다.
그리고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결국 목숨을 마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참회하였다.
“무릇 대승의 가르침이란 것은
불법 중에서 궁극적인 것이다.
문장55)이 없어진다 하여도
지극한 이치는 깊고 그윽하다.
소홀하게도
내가 어리석은 까닭에
선현들을 반박하였다.
그리고 배척하였다.
그러니 업보의 이치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이 멸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감히 학인들에게 고한다.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각자 너희들의 뜻을 신중히 할 것이다.
그리고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지가 진동하였다.
그러더니 그는 이내 목숨을 마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죽은 곳의 땅이 무너졌다.
그러더니 구덩이가 되었다.
그리고, 도반들이 시체를 태워서
유해를 수습하였다.
그리고 표시를 세웠다.
이 때 나한이 이것을 보았다.
그리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오, 애석하도다.
지금의 이 논사는 감정에 따라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였다.
그리고 대승을 비난하였다.
그러더니 무간지옥(無間地獄)56)에 떨어졌구나.”
▪ 이 나라의 서북 국경의 긍가하 동안(東岸)에는
마유라성(摩裕羅城)57)이 있다.
그런데 둘레는 20여 리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번성하다.
그리고, 맑은 물이 교차하여 흐르고 있었다.
유석(鍮石)과 수정과 보배그릇이 산출된다.
▪ 성에서 멀지 않으며 긍가하를 접해 있는 곳에 커다란 천사(天祠)가 있다.
그런데 신령스러운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 연못이 있다.
그런데 돌을 쌓아서 둑을 만들었다.
그리고 긍가의 물을 끌어다 보충하고 있다.
5인도국 사람들은 이것을 긍가하의 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복을 낳고 죄를 소멸시키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제나 먼 곳에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
그리고 몸을 씻는다.
또한 선업을 좋아하는 여러 왕들이 복사(福舍)를 세웠다.
그래서 맛난 음식을 갖춰 놓았다.
그리고 의약품을 비축해 두었다.
그리하여 짝이 없는 홀아비와 과부[鰥寡]들에게 베풀었다.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孤獨]들에게 제공하였다.
▪ 이곳에서 북쪽으로 3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바라흡마보라국(婆羅吸摩補羅國)[**북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11) 바라흡마보라국(婆羅吸摩補羅國)
▪ 바라흡마보라국58)의 둘레는 4천여 리이다.
[지금의 Alakananda강 유역 지방인 Gaṛwāl ]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4방으로 산이 에워싸고 있다.
나라의 큰 도성59)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 스리나가르Srinagar ~ Harwar ]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번창하다.
그리고 집들은 부유하다.
토지는 비옥하다.
그리고 농사는 시기에 맞추어서 파종한다.
유석과 수정이 난다.
그리고 기후는 조금 춥다.
그리고 풍속은 강건하다.
그리고 용맹스럽다.
학예를 배우는 자는 적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윤을 따른다.
사람들의 성품은 사납고 급하다.
그리고 삿된 것과 바른 가르침을 뒤섞어서 믿고 있다.
가람은 다섯 곳 있다.
그리고 승도는 매우 적다.
천사는 10여 곳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 국경의 북쪽에 있는 대설산(大雪山) 안에는
소벌라나구달라국(蘇伐剌拏瞿呾羅國)60)[**당나라 말로는 금지(金氏)라고 한다**]이 있다.
질이 좋은 황금이 난다.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동서로 길다.
그리고 남북으로 좁다.
그런데 또는 동녀국(東女國)61)이라고도 부른다.
대대로 여인이 나라를 다스렸다.
남자들도 왕이 된다.
하지만 정치를 알지 못하였다.
대장부들은 오직 정벌하러 나간다.
또는 농사를 지을 뿐이었다.
토지는 보리가 자라기 좋다.
그리고 양과 말을 많이 기르고 있다.
기후는 몹시 춥다.
그리고 사람의 성품도 조급다.
그리고 난폭하다.
동쪽으로는 토번국(吐蕃國)62)에 접해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우전국(于闐國)63)에 접해 있다.
[Khotan]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서쪽은 삼파가국(三波訶國)을 접해 있다.
▪ 말저보라로부터 동남쪽으로 4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구비상나국(瞿毘霜那國)[**중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12) 구비상나국(瞿毘霜那國)
▪ 구비상나국64)의 둘레는 2천여 리이다.
[Srinagar -> Kāshipur ]
https://www.google.co.kr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4~15리이다.
그런데 높고 험하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번성해 있다.
꽃 숲과 못과 늪이 이따금 교차하고 있다.
기후와 토지는 말저보라국과 같다.
풍속은 순박하다.
그리고 부지런히 배우고 복 쌓기를 좋아한다.
많은 이들이 외도를 믿는다.
그리고 현세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가람은 두 곳 있다.
승려는 백여 명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30여 곳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 큰 성 옆에 옛 가람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솔도파가 있다.
이것은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그리고 높이는 2백여 척에 달한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법의 핵심들을 설하셨던 곳이다.
▪ 그 옆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래의 머리털과 손톱을 안치한 두 개의 솔도파가 있다.
그런데 각각 높이는 1길[丈] 남짓하다.
▪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4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악혜체달라국(惡醯掣呾邏國)[**중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13) 악혜체달라국(惡醯掣呾邏國)
▪ 악혜체달라국65)의 둘레는 3천여 리이다.
[Kāshipur -> Rohilkhand 지방의 동쪽에 Ahicchattra ]
https://www.google.co.kr
그리고 큰 도성66)의 둘레는 17~18리이다.
[ Rohilkhand -> Bareill ]
https://www.google.co.kr
험한 지세에 의지해 있다.
곡식이 잘 자란다.
그리고 숲과 샘이 많다.
기후는 온화하고 맑다.
풍속은 질박하다.
도를 좋아한다.
그리고 학업에 열심이다.
그리고 재능이 많고 박식하다.
가람은 10여 곳 있다.
승도는 천여 명 있다.
소승인 정량부(正量部)67)의 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아홉 곳 있다.
이교도들은 3백여 명 있다.
이들은 자재천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재를 몸에 바른다.
▪ 성 밖에는 용이 사는 연못이 있다.
그런데 그 옆에 솔도파가 있다.
이것은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예전에 이곳에서 용왕을 위하여
7일 동안 설법을 하셨다.
▪ 그 옆에 네 기의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이다.
▪ 이곳에서 동쪽으로 260~270리 간다.
그러다 보면 긍가하를 건너게 된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비라산나국(毘羅刪拏國)[**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14) 비라산나국(毘羅刪拏國)
▪ 비라산나국68)의 둘레는 2천여 리이다.
[ Bareill ->Etah현의 Bilsaŗ ]
https://www.google.co.kr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이다.
기후와 토지는 악혜체달라국(堊醯掣呾邏國)과 같다.
풍속은 용맹스럽고 거친다.
사람들은 학예를 배운다.
그리고, 외도를 높이 믿는다.
그리고 불법을 믿는 자는 적다.
가람은 두 곳 있다.
승도는 3백 명 있다.
이들은 모두 대승법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다섯 곳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 큰 성 안에는 옛 가람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솔도파가 있다.
그런데, 기초가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백여 척이나 된다.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7일 동안 『온계처경(蘊界處經)』을 설하셨다고 한다.
▪ 그 곁에 또한 과거 네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이 있다.
▪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2백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겁비타국(劫比他國)[**구역에서는 승가사국(僧迦舍國)이라고도 한다. 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15) 겁비타국(劫比他國)
▪ 겁비타국69)의 둘레는 2천여 리이다.
그리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기후와 토지는 비라산나국(毘羅刪拏國)과 같다.
풍속은 순박하고 온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예를 배우고 있다.
가람은 네 곳 있다.
승도들은 천여 명 있다.
모두 소승의 정량부의 법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열 곳 있다.
이교도들이 어울려 산다.
그러면서 함께 대자재천을 섬기고 있다.
▪ 성의 동쪽으로 20여 리 간다.
그러다 보면 큰 가람이 있다.
그 규모는 웅장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조각 솜씨는 극치를 이루었다.
그리고 성현들의 모습과 동상의 장엄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승도들은 수백 명 다.
정량부의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정인(淨人)들이 그 옆에서 살고 있다.
▪ 가람의 큰 울타리 안에는
세 개의 보석으로 만든 층계가 있다.
이는 남북으로 늘어서 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곳은 여래께서 33천(天)으로부터 내려오신 곳이다.
옛날 여래께서
승림(勝林)70)에서 일어나
천궁(天宮)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선법당(善法堂)에 머무시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석 달이 지난 뒤 아래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고자 하였다.
그러니 제석천이 신통력으로 이 보석 계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중간의 계단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왼쪽 것은 수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하얀 은으로 만들어졌다.
여래께서 선법당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여러 하늘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운데 계단을 밟고 내려오셨다.
이 때 대범왕은 하얀 불자(拂子)를 들고 은 계단을 밟고서 오른쪽에서 모셨다.
그리고 제석천은 보석 덮개를 들고 수정 계단을 밟으며 왼쪽에서 모셨다.
그러면서 내려왔다.
하늘의 무리들은 허공을 타고 놀며 꽃을 뿌렸다.
그리고 덕을 찬양하였다고 한다.
수백 년 전에는 계단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무너져 사라지고 말았다.
여러 나라의 군왕들은
계단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래서 벽돌과 돌을 쌓고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지금의 옛 기단은 옛날 보석 계단을 본뜬 것이다.
그 높이는 70여 척에 달한다.
위에는 정사를 세웠다.
그리고 중간에는 석불상이 있다.
그리고 좌우의 계단에는 제석과 범천의 형상이 있다.
그런데 본래의 것을 본떴다.
그래서 역시 아래로 내려오는 형세로 이루어져 있다.
곁에는 석주가 있다.
그런데 높이는 70여 척이다.
이는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감색을 띠고 광택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단단하고 매끄럽다.
위에는 웅크리고 앉아서
계단을 향하고 있는 사자의 상71)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이한 모습들을 새겼다.
그래서 4방으로 빙 둘러 놓았다.
사람들의 죄와 복에 따라서 그림자가 기둥 속에 나타난다.
▪ 보석 계단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다.
이것은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이다.
▪ 그 옆에 솔도파가 있다.
여래께서 예전에 이곳에서 목욕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옆에 정사가 있다.
이곳은 여래께선 선정에 드신 곳이다.
▪ 정사 옆에 커다란 돌 기단이 있다.
길이가 50걸음 된다.
그리고 높이는 7척이다.
이것은 여래께서 거니시던 곳이다.
그런데 발로 밟으신 흔적에는 모두 연꽃 문양이 있다.
▪ 기단의 좌우에는 각각 작은 솔도파가 있다.
이는 제석과 범왕이 세운 것이다.
▪ 제석과 범왕이 세운 솔도파 앞에는
연화색필추니72)가 부처님을 먼저 보고자 하여
전륜왕의 모습으로 변화한 곳이다.
여래께서 천궁으로부터 섬부주로 돌아오실 때다.
소부저(蘇部底)73)[**당나라 말로는 선현(善賢)이라고 하고 구역에서는 수부리(須扶提) 또는 수보리(須菩提)라고 하며
번역해서 선길(善吉)이라고 하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가
석실에서 선정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고요히 생각하여 말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인간과 하늘의 호위를 받으시며 내려오신다.
나와 같은 자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일찍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든 법의 공(空)함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법성을 체득하였다.
때문에 이 혜안(慧眼)으로써
법신(法身)을 관찰하였던 것이다.
이 때 연화색(蓮華色)필추니는 부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전륜왕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7보(寶)74)를 이끌었다.
그리고 보(步)ㆍ마(馬)ㆍ거(車)ㆍ상(像)의 네 종류의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아갔다.
필추니는 세존께서 내려오신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래께서 고하셨다.
“네가 나를 처음으로 본 것이 아니다.
선현이 모든 법의 공함을 관찰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법신을 본 것이다.”
성역의 울타리 안에는
신이로운 기적이 잇달아 일어난다.
▪ 그 큰 솔도파의 동남쪽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
그런데 언제나 용이 성스러운 유적지를 보호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 있다.
그러므로 쉽게 침범하기가 어렵다.
세월이 흘러 저절로 무너진 것이다.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2백 리를 채 가지 않아
갈약국사국(羯若鞠闍國)[**당나라 말로는 곡녀성국(曲女城國)이라고 하며 중인도의 경계이다**]에 이른다.
¶¶
『대당서역기』 4권(K1065 v32, p.397a01)
[주]------
주<1 범어로는 ṭakka이다.
주<2 범어로는 vipāśā이다.
지금의 Biās강이다.
주<3 책가국은 본서에 의하면
비파사하Vipāśā와 신도하(Indus)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 신도하는 지금의 오하(五河:펀잡)의 가장 서쪽에 있는 인더스강은 아니다.
『자은전』에서 보이는 전달라파가하(旃達羅婆伽河, Candrabhāga),
즉 지금의 Chenāb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Chenāb강]
https://www.google.co.kr
주<4 범어로는 puṇya-śāla이다.
이는 나그네를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자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주<5 사갈라는 범어로는 śākala라고 한다.
사게라(奢揭羅), 사가라(沙柯羅), 사갈(沙竭)이라고도 쓴다.
지금의 Śiālkoṭ이다.
기원전 2세기 그리스 계통의 메난드로스(미란타)가 인도의 승려인 용군(龍軍 혹은 那先: Nāgasena)과 교리문답을 한 곳이라는 주장도 있다.
[Śiālkoṭ]
https://www.google.co.kr
주<6 범어로는 maherākula. Mahirakula,다.
즉 태양을 뜻하는 mahir와 종족(種族)을 뜻하는 kula의 합성어이다.
그런데, 아마도 mahira가 mahā(大)와 혼동되어 대족(大族)이라고 표기된 듯 싶다.
일명 앗틸라 대왕이라 불리는 잔혹한 왕 Mihirakula로 추측된다.
앗틸라 대왕은 515년에 즉위한다. 그리고 Śiālkoṭ에 도읍을 정한다.
하지만 확증은 할 수 없다.
주<7 범어로는 bālāditya, bāla-āditya다.
막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다.
유일(幼日)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몇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왕은
Narasiṁha Gupta라고 하는 설과 Bhānu Gupta라고 하는 설이 있다.
주<8 『선현기(先賢記)』라고 하여 일본에 전해진 책도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간행된 것도 『인도기(印度記)』이다.
현존하고 있지 않다.
주<9 범어로는 cīnabhukti이다.
중국(中國)의 영지(領地)라는 뜻이다.
아므리차르(Amritsar) 로부터 Śiālkoṭ로 가는 도중에 있는 Chiniyari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mritsar -> Chiniyari -> Śiālkoṭ ]
https://www.google.co.kr
주<10 『자은전』 권2에 의하며
현장은 지나복저국의 돌사살나사(突舍薩那寺, toṣasana-vihāra, 樂授寺)에서
비니다발랍파(毘膩多鉢臘婆, vinītaprabha, 調伏光)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아비달마(阿毘達磨)와 인명(因明) 등을 14개월에 걸쳐서 배웠다.
주<11 범어로는 tamasa-vana이며 어두운 숲이라는 뜻이다.
원문에는 사림(闍林)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자로 보인다.
다른 판본에서는 거의 암림(闇林)이라고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다.
지금의 아므리차르의 남남동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Sultānpu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mritsar ->-> Sultānpur ]
https://www.google.co.kr
주<12 범어로는 kātyāyana. 가저야야나(迦底耶夜那), 가타연나(迦陀衍那)라고도 표기한다.
바라문 10성 가운데 하나다.
인도 귀족의 이름이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가다연나는 서북인도의 불교를 선양하였던 위대한 논사다.
그래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출생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기원 전후의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주<13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 20권을 말한다.
설일체유부의 체계를 기록한 것이다.
『대비바사론』 2백 권이 있다.
이는 이 책에 대한 주해(注解)이다.
대비바사론은 가습미라에서 5백 명의 대아라한에 의해 저술된다.
이는 이른바 제4결집의 성과다.
주<14 범어로는 jālaṃdhara이다.
지금의 아무리차르의 동남동쪽에 있는 Jullundur(Jalandhar)에 해당한다.
[ Amritsar -> Jullundur(Jalandhar)]
https://www.google.co.kr
또한 야란타라(惹爛陀羅), 좌란타라(左爛陀羅)라고도 한다.
『자은전』에 의하면
현장은 나가라타나사(那伽羅馱那寺, Nagaradhana)에 도착한다.
그래서 그곳의 학승인 전달라벌마(旃達羅伐摩:月冑, Candravarman) 아래에서
4개월 동안 『중사분비바사(衆事分毘婆沙)』(『아비달마품류족론』)을 수학하였다.
또한 현장은 귀로에 오른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인 오지다(烏地多, Udita)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주<15 지금의 Beas강 상류, 히말라야 산록의 굴곡이 진 길을 따라가는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 Beas강 상류 ]
https://www.google.co.kr
주<16 범어로는 kulūta이며 Beas강의 상류,
지금의 Kaṅgra의 Kulū 지방,
[Kaṅgra ]
https://www.google.co.kr
예전에는 Kuṇidas라고 하는 지방이다.
브라흐미 문자화폐, 가로슈티 문자화폐들이 출토되었다.
주<17 이 지방의 오늘날의 수도는 Sultānpur이다.
그런데 옛 도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Nagar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Amritsar ->-> Sultānpur ]
https://www.google.co.kr
주<18 여러 서적에는 유석(鍮石)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주<19 종래의 연구가는 이것을 서장인(西藏人:티벳인)이 말하는 Lho-yul, 즉 Kulū 및
그 근방 사람들이 일컫는 지명 Lāhul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서장학자인 Jäschke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것은 인도인의 호칭이다.
서장인 자신은 Gár-źa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장한다.
[Kaṅgra ]
https://www.google.co.kr
주<20 티벳어로는 mar-sa(즉 낮은 지역, Ladak의 고금에 걸친 通名)라고 한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다.
주<21 범어로는 śatadru라고 한다.
지금의 Sutlej, Satlej 강의 옛 이름이다.
앞서 ‘큰 산을 넘어서 거대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다음을 의미한다.
히말라야산의 서남쪽 돌출부를 넘어서 Sutlej강을 동남쪽으로 건넌다.
이러한 의미이다.
[Kaṅgra -> Sutlej, Satlej 강]
https://www.google.co.kr
주<22 지금의 Sarhind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Sutlej, Satlej 강 ->Sarhind ]
https://www.google.co.kr
주<23 범어로는 pāriyātra이다.
바이라트 Bairāt, Vairāṭa에 해당한다.
지금의 델리의 서남쪽 105마일,
쟈이푸르의 북쪽으로 41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다.**
고대 마츠야(Matsya)국이다.
[Bairāt, Vairāṭa ]
https://www.google.co.kr
주<24 바이라트이다.
낮은 적토(赤土)의 구릉으로 에워싸인 둥근 계곡의 한가운데에 지금의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동북쪽으로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는 산의 바위에 아쇼카왕의 소마애조칙(小磨崖詔勅)이 있다.
그리고 또한 조칙(詔勅)은 도시의 서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구릉 위에서 발견된다.
이는 현재 캘커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지역 유적지의 발굴에 의해
그리스 화폐, 인도-그리크 화폐, 기원후 1세기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감 종류가 발견되었다.
[Bairāt, Vairāṭa ]
https://www.google.co.kr
주<25 이 지역의 주민은 예로부터 용감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마누법전』에는 전투를 벌일 때 선봉에 서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들어있다.
주<26 도시의 서남쪽 1마일 떨어진 지점에 Calcutta-Bairāt 조칙이 발견된 구릉 위에는
지금도 불교사원의 유적이 있다.
주<27 범어로는 mathurā이다.
마투라(摩偸羅)ㆍ마유라(摩鍮羅)ㆍ마두라(摩頭羅)ㆍ마돌라(摩突羅)ㆍ마도라(摩度羅)로 음사하고 있다.
그리고, 밀선(密善)ㆍ미밀(美蜜) 또는 공작(孔雀) 등으로 옮긴다.
지금의 야무나강 서남 일대의 지역,
마투라 Mathura(Muttra)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도는 같은 이름의 도시이다.
이 나라는
이른바 부처님 재세시 인도의 16개국 가운데 하나였던 Śūrasena이다.
그리고, 서방(西方)과의 통상로였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부처님은 재세 중에 종종 이곳에서 노니시며
교화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의 Śunga왕조기에는
불교와, 쟈이나교가 함께 번영하였다.
기원후 1세기 무렵부터 쿠샨 왕조가 이곳을 점거하였다.
하지만 인도의 종교는 보호 성행하였다.
[Bairāt, Vairāṭa -> Mathura]
https://www.google.co.kr
4세기 굽타 왕조기에 이곳을 방문한 법현**은 스무 곳의 승가람, 3천 명의 승려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이후의 상황은 거의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 지역은 크리슈나(Kṛṣna)의 탄생지다.
그래서 바라문의 성지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시가의 남쪽에는 옛 성이 있었다.
이 지역은 주로 쿠샨 왕조로부터 굽타 왕조에 걸치는
이른바 마투라 미술의 중심지였다.
주<28 범어로는 pūrṇa-maitrāyaṇi-putra라고 한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설법이 제일이었던 부루나를 완전하게 음사한 이름이다.
주<29 정월과 5월과 9월의 3개월은
그 달(각기 앞의 반 개월, 곧 1일부터 15일까지) 중 8재계를 지키는 달로,
살생 등을 끊고 비행(非行)을 삼간다.
그 3개월을 3장재월이라 한다.
또 삼장월(三長月)ㆍ삼재월(三齋月)ㆍ선월(善月)ㆍ신족월(神足月)ㆍ신통월(新通月)ㆍ신변월(神變月) 등이라고도 한다.
주<30 일년 중의 1ㆍ5ㆍ9월의 세 달과,
한달 중의 8ㆍ14ㆍ15ㆍ23ㆍ29ㆍ30일의 여섯날을 말한다.
모두 신도들이 정진해야 하는 기간이다.
3재월의 경우 정진의 기간이 길다.
때문에(한달씩) 3장월(張月)이라고도 한다.
주<31 인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여러 보살들을 공양 올리는 상황에 관해서는 『법현전』에서는
연등(燃燈)ㆍ기악(伎樂)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본서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주<32 『아육왕전』3의 우류만타산(優留曼陀山),
범어로는 urumaṇḍa라고 한다.
우루만타(優樓漫陀), 오로문다(烏盧門茶)로 음사한다.
그리고, 대제호산(大醍醐山)으로 옮기고 있다.
가람은 『잡아함경』25의 나타발치가(那吒跋置迦, naṭabhaṭika) 또는 나라발리(那羅拔利)ㆍ나치바치(那哆婆哆)로 음사하고 있다.
마투라의 장자(長者)인 나치(那哆, naṭa)와 파치(婆哆 bhaṭa)가 세운 것이라고 한다.
주<33 범어로는 upagupta이며 우파국다(優婆鞠多)라고도 한다.
근호(近護)ㆍ근밀(近密)로 번역한다.
마투라의 상인의 아들이다.
상나화수(商那和修, Śānakavāsin)의 제자다.
아육왕의 초빙을 받아서 화씨성(華氏城)으로 간다.
그래서 왕과 부처님의 유적을 참배하였다.
부법장(付法藏) 제4조 또는 제5조이다.
주<34 댓가지를 던져 넣었던 사례는 『아육왕경』 권9ㆍ10에 아주 많이 등장한다.
주<35 원숭이가 꿀을 바친 설화는 『현우경』 권12, 『불오백제자자설본기경(佛五百弟子自說本起經』,
『유부약사(有部藥事』 권17, 『유부파승사(有部破僧事』 권12 등 그 밖의 여러 곳에 등장한다.
이 설화는 불교 조각의 소재에 많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산치 북문(北門) 오른쪽 기둥의 부조(浮彫)에서는
부처님이 보리수로 상징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원숭이가 부처님의 발우를 받들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주<36 계급이 사(士) 이상인 사람이 죽었을 때 흙을 높이 쌓아 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묘표(墓標)로서 나무를 심은 것을 말한다.
주<37 범어로는 sthāneśvara이다. 지금의 Thānesar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서사시에 등장하는 유명한 전장(戰場)이었다.
그리고 쿠루족의 고향으로서의 성지이기도 하였다.
현장이 방문할 당시의 Kanauj의 계일왕(戒日王)의 선왕이었던 Pushabhūkti가 도읍으로 정한 곳이다.
그리고, 바라문의 성지이다.
그리고, 중인도 Madhyadeśa의 서경(西境)이기도 하였다.
[Mathura ->Thānesar]
https://www.google.co.kr
주<38 복덕을 낳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보통 사원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말이다.
주<39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두 왕 사이의 전투에 대해서는
인도의 서사시 Mahābhārata에서 보이는 Kuru족과 Pāṇḍu족 간에 일어난 것이다.
이 유명한 전장은
지금도 Thānesar의 근교에 그 전설로 전해지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시체가 산을 이룬 곳(시체의 거리)인 Asthipur는 Thānesar의 서쪽 교외에 있다고 한다.
바가바드 기타 제1장의 첫구절이 바로 ‘정의의 벌판, 쿠루족의 벌판에서(dharmakṣetre, kurukṣetre)’ 이렇게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장이 말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쿠루의 벌판’-kurukṣetra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여기에서 복지는 특정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복전(福田)과 동일한 뜻의 일반 명사일 뿐이다.
복지와 복전 모두 원음은 팔리어로 puakkhetta이다.
kkhetta의 산스크리트원음은 kṣetra이다.
주<40 범어로는 srughna이다.
지금의 Dehra Dun지방의 Kālsi에 가까운 Sugh이다.
[Thānesar -> Dehra Dun지방의 Kālsi에 가까운 Sugh]
https://www.google.co.kr
주<41 범어로는 yamunā,
또는 Jumnā라고도 한다.
인도 5대 강 가운데 하나이다.
야포나(耶蒲那)ㆍ요부나(遙扶那)ㆍ염마나(閻摩那)ㆍ염모(焰牟)로도 음사된다.
[Dehra Dun지방 -> yamunā, 또는 Jumnā 강 ]
https://www.google.co.kr
주<42 『자은전』에 의하면
현장은 이 나라에서 사야국다(闍耶麴多)라고 하는 학승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겨울 한 철과 봄철의 반 동안 경부(經部)의 주석의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주<43 범어로 durgati이고 아파가야저(阿波伽耶底)라 음역한다.
악업에 의해 태어나는 세계를 말한다.
주<44 승가라국, 즉 석란(錫蘭:세일론)을 가리킨다.
주<45 제바는 성제바(聖提婆, Ārya-deva), 성천(聖天)이라고도 불린다.
남인도 바라문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는 석란(錫爛, 세일론)이라고도 한다.
3세기 무렵의 인물로 용수에게 나아가 출가하였다.
그리고 외도를 논파하였다.
그리고 나란타가람에 머물렀다.
하지만 사도(邪道)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부법장(付法藏) 제14조이다.
저서는 여기에 나오는 『광백론본(廣百論本)』 1권(唐 玄奘譯),
『백론(百論)』 2권(姚秦 鳩摩羅什譯)과 그 밖의 것이 전하고 있다.
주<46 명도(冥途)ㆍ지옥이나 아귀 세계를 말한다.
주<47 범어로는 matepura, 또는 matipura이다.
현장의 기사에 따르면
솔록근나(窣祿勤那)로부터 동쪽으로 나아가서
갠지스강을 건넌 건너편 언덕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을 배제하고 지금의 Rohilkhand의 Bijnor 북방 약 8마일 지점에 있는 Manḍāwar를 해당지역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주<48 범어로는 śūdra이다.
수달라(戍達羅)라고도 한다.
인도의 4성제도 중 최하위에 속하는 노예계급이다.
다른 계급에 봉사하는 것이 임무이다.
주<49 『자은전』에 의하면 이 지역에 밀다사나(蜜多斯那, Mitrasena)라고 하는 학승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덕광(德光)의 제자였다.
현장은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봄철 반 동안과 여름 한 계절에 걸쳐서
『변진론(辯眞論)』ㆍ『발지론(發智論)』 등의 소승논서를 수학하였다.
주<50 범어로는 devasena이다.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주<51 불법을 깨달아 불도의 과(果)를 얻는 것으로 열반을 말한다.
주<52 유부(有部)의 교학 체계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부파의 설까지도 인용하였다.
때문에 대소승의 학도들에게
불교의 기초학 연구서로서
매우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장에 의한 한역본 30권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ㆍ일본에서도
오늘날까지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주<53 『구사론』의 조직을 그대로 따르면서
유부의 정통성을 드날리고자 쓰여진 책이다.
현장이 한역한 80권본이 있다.
주<54 범어로는 vimalamitra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주<55 원문은 명미(名味)로 되어있다.
미(味)는 간혹 음절(vyajana)의 뜻으로 잘못 번역되어 쓰인다.
주<56 범어로 avici이며 8열지옥(熱地獄)의 하나이다.
남섬부주 아래 2만 유순 되는 곳에 있는 혹독한 지옥이다.
이 지옥은 괴로움을 받는 것이 끊임없다.
그러므로 이같이 이름한다.
주<57 범어로는 mayūra라고 한다.
인도문헌에서 Gangādvāra, Māyāpuri라고 한다.
이는 비슈누신을 제사지내는 성지이다.
지금의 Hardwar이다.
주<58 범어로는 brahmapura이다.
앞서 현장이 ‘북쪽으로 간다’는 말을 ‘동북쪽으로 간다’고 정정하여,
지금의 Alakananda강 유역 지방인 Gaṛwāl로 추정된다.
이 지방에는 오래된 쟈이나교의 건조물이 있다.
[지금의 Alakananda강 유역 지방인 Gaṛwāl ]
https://www.google.co.kr
주<59 지금의 스리나가르(Harwar의 동북쪽 70킬로미터 지점)로 추정된다.
[ 스리나가르Srinagar ~ Harwar ]
https://www.google.co.kr
주<60 범어로는 suvarṇa-gotra이다.
그대로 옮기면 금지(金氏)이다.
히말라야산 중에 있는 나라다.
옛날에는 전설 속의 나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의 각주에 소개될 『당서(唐書)』의 기사를 통해 보면
실제로 있었던 나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장이 직접 방문하였던 나라는 아니다.
주<61 나라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현장이 기록한 바와 같이 여자가 정치를 하는 까닭인데
‘동’이라는 방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서 제11권에 등장하게 될 ‘서녀국(西女國)’에 상대하기 때문이다.
『당서(唐書)』 권221상 「동녀전(東女傳)」에는
“동녀(東女)는 또한 소벌라나구달라(蘇伐剌拏瞿呾羅)라고 한다.
강(羌)의 별종(別種)이다.
서해(西海)에도 또한 여인들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있으므로
이곳을 동(東)이라 일컬어서 구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나라의 위치를 일부에서는 Hunza-Nagar와 일치한다고 보는 설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많다.
주<62 중국인이 티벳을 7~10세기에 걸쳐서
토번(吐蕃)이라고 부른다.
이는 지역적 명칭으로서 존속하였던 것이다.
티벳인 자신은 스스로를 8세기 이래 Bod라고 부르고 있었다.
주<63 서역 남도(南道)의 Khotan을 말한다.
권12에 자세하게 나온다.
[Khotan]
https://www.google.co.kr
주<64 범어로는 Goviṣana이다.
현재의 Kāshipur에서 동쪽으로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는 폐지(廢址)가 그 수도로 추정되고 있다.
[Srinagar -> Kāshipur ]
https://www.google.co.kr
주<65 범어로는 ahi-chattra이다.
오늘날 델리의 동쪽 Rohilkhand 지방의 동쪽에 Ahicchattra라 불리는 지역이 있다.
[Kāshipur -> Rohilkhand 지방의 동쪽에 Ahicchattra ]
https://www.google.co.kr
주<66 Bareilly의 서쪽 3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Rāmnagar로 추정되고 있다.
[ Bareilly의 서쪽 3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Rāmnagar]
[ Rohilkhand -> Bareill ]
https://www.google.co.kr
주<67 소승 20부파 가운데 하나다.
상좌부에 속하는 부파이다.
현장이 인도를 방문할 당시에 이 부파는 설일체유부에 버금가게 널리 인도에 퍼져 있었다.
특히 중ㆍ남ㆍ서인도에 이 부파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동인도에도 조금 행해지고 있었던 듯하다.
주<68 viraṣaṇa 혹은 bhiraṣaṇa 등으로 원음(原音)을 추정하고 있다.
지금의 Etah현의 Bilsaŗ라고 한다.
[ Bareill ->Etah현의 Bilsaŗ ]
https://www.google.co.kr
주<69 범어로는 kapitthikā, kapitthaka이다.
옛 이름인 승가사(僧迦舍, saṃkāśya)는
승가사(僧伽舍)ㆍ승가시(僧伽施)ㆍ승가시(僧迦尸) 등으로도 음사되고 있다.
주<70 사위국(舍衛國) 안의 급고독원(給孤獨園)이 있던 장소라고 한다.
주<71 『법현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사 뒤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런데 높이는 30주(肘)이다.
그리고 위에 사자를 만들었다.
기둥에는 4방에 불상이 있다.
안팎으로 밝게 빛난다.
그리고 맑기가 마치 유리와도 같다.
외도의 논사들이 사문과 함께 이곳의 주처(住處)를 놓고 다투었다.
그런데 사문이 지고 말았다.
이에 함께 맹세를 하며 말하기를
‘만일 이곳이 사문의 주처라면
바야흐로 영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둥머리에 있던 사자가 곧 크게 포효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에 외도가 크게 놀라서 마음으로부터 굴복하고 물러났다”
이처럼 기록하고 있다.
주<72 연화색은
범어로 utpalavarṇā이다.
연화선(蓮華鮮)ㆍ화색(華色)이라고도 번역한다.
연화색필추니는 울선국(鬱禪國:鄔闍衍那城) 사람이다.
사위성에 가서 부처의 허락을 얻어 비구니가 되었다.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그래서 비구니의 장로(長老)가 되었다.
주<73 범어로 Subhūti이다.
현장은 존재(存在)ㆍ출현(出現)의 뜻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구역에서는 행복ㆍ부로 해석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당나라 의정은 묘생(妙生)이라 번역한다.
주<74 전륜성왕에게
그 징표로써 나타나는 일곱 가지 길상스러운 물건들이다.
즉 금륜보(金輪寶)ㆍ백상보(白象寶)ㆍ감마보(紺馬寶)ㆍ
신주보(神珠寶)ㆍ옥녀보(玉女寶)ㆍ거사보(居士寶)ㆍ
주병보(主兵寶)를 가리킨다.
★1★
◆vtyy3632
| ◈Lab value 불기2569/02/01 |
|
♥York, England
♥단상♥ |
|
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5/02/2569-02-01-k1065-004.html#3632 sfed--대당서역기_K1065_T2087.txt ☞대당서역기 제4권/전체12권 sfd8--불교단상_2569_02.txt ☞◆vtyy3632 불기2569-02-01 θθ |
■ 선물 퀴즈
방문자선물 안내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 페이지
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범】jñāna-pāramitā 10바라밀의 하나. 지는 지혜. 바라밀은 도(度)ㆍ도피안(到彼岸)이라 번역. 만법의 실상을 여실하게 아는 지혜는 생사하는 이 언덕을 지나서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배가 되므로 지바라밀이라 함.
답 후보
● 지바라밀(智波羅蜜)
지혜(智惠)
진공관(眞空觀)
진사(塵沙)
진아(眞我)
진에개(瞋恚蓋)
진이숙(眞異熟)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M_▶더보기|◀접기|
■ 음악
Yves Duteil - This Melody
Karpatt - En Force
Francis Cabrel - J'ai Peur De L'avion
Frank Michael (Collector Edition) - Parce Que Je T'aime
Michel Sardou - Je Suis Pour
Balavoine - Partir Avant Les Miens
Jean Ferrat - Les Enfants Terribles
■ 시사, 퀴즈, 유머
뉴스
퀴즈
퀴즈2
유머
■ 한자 파자 넌센스 퀴즈
032▲ 爫㕚中之止 ■ 조조중지지 32 ( 손톱조 조 ) (손톱 조 ) cf 갈래 차叉 (가운데 중 )( 갈 지 )( 그칠 지 )
033▲ 支辶尺天艹 ■ 지착척천초 33 (( 지탱할 지 )( 쉬엄쉬엄 갈 착 )( 자 척 )( 하늘 천 ) 초두머리 초 ) 재춘법한자
【 】 ⇄✙➠
일본어글자-발음
중국어글자-발음
■ 영어단어 넌센스퀴즈- 예문 자신상황에 맞게 바꿔 짧은글짓기
■ 번역퀴즈
번역
번역연습(기계적 번역내용 오류수정 연습)
■ 영-중-일-범-팔-불어 관련-퀴즈
[wiki-bud] Nanda
[san-chn] vraṇa-mukha 瘡門
[san-eng] adhyāpayituṃ $ 범어 to teac (infinitive of causative of adhi+i, to study)
[pali-chn] vedalla 大方等, 方等
[pal-eng] rudanta $ 팔리어 pr.p. of rudaticrying; lamenting.
[Eng-Ch-Eng] 別 (1) To distinguish, discriminate. Discrimination, differentiation. (vikalpa) (2) Split, be divided, branch off from. (3) Another, different, particular, separate, exception, difference, distinction. (prthak) (4) To teach, or explain separately. (5) Special, exceptional.
[Muller-jpn-Eng] 伎藝 ギゲイ skill, art
[Glossary_of_Buddhism-Eng] ARHATSHIP FOUR STAGES ☞
See also: Anagamin; Arhat; Beyond Learning Stage.
Refers to four levels of Enlightenment, culminating in Arhatship.
Arhats are no longer subject to rebirth in Samsara, i.e., in the cycle of
Birth and Death.
Editor: na
“These are the four stages of enlightenment on the Theravada path,
namely, the stage of Stream-enterer (Srotapanna), the Once-returner,
the Non-returner (Anagamin), and the Arhat.”
Chan: 489 #0608
【book-page-40 41】
[fra-eng] progresser $ 불어 get along, proceed, progress
[chn_eng_soothil] 日宮 The sun-palace, the abode of 日天子 supra.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ṁ] ▼●[羅什] 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여래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玄奘] 何以故? 如來說諸相具足, 即非諸相具足.
[義淨] 何以故? 如來說勝相, 即非勝相.
05-03 तत्कस्य हेतोः ? या सा भगवन् लक्षणसंपत्तथागतेन भाषिता सैवालक्षणसंपत्।
tatkasya hetoḥ | yā sā bhagavan lakṣaṇasampattathāgatena bhāṣitā
saivālakṣaṇasampat |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오면, 복덕갖춘분이시여! 그렇게오신분에 의해 ‘모습의
갖춰짐’이(라) 일컬어진 그것은 바로 ‘모습 아님의 갖춰짐’이(라 일컬어진 것입니다).”
문장분석 KEY : ‘동사가 없을 때는 관련문장에서 빌려온다.’ or 'dehalidīpanyāya'
▼▷[tatkasya] ① tat(pn.ƿ.nom.) + kasya(pn.ƾ.gen.) → [그것은、 어떤]
② tat(pn.ƿ.nom.acc.sg.) < tad(pn. that, he, it, she)
② kasya(pn.ƾƿ.gen.sg.) < kim(pn. which thing, who, what)
▼[hetoḥ] ① hetoḥ(ƾ.gen.) → [이유의? → 이유인가 하오면,]
② hetu(ƾ. cause, reason, motive; source, origin; a means or instrument)
▼▷[yā] ① yā(pn.Ʒ.nom.) → [(어떠한) 그것인]
② yā(pn.Ʒ.nom.sg.) < yad(who, which, what)
▼[sā] ① sā(Ʒ.nom.) → [그]
▼[bhagavan] ① bhagavan(ƾ.voc.) → [복덕갖춘분이시여!]
② bhagavat(nj. glorious, illustrious: ƾ. a god, deity; of Buddha)
▼[lakṣaṇasampattathāgatena] ① lakṣaṇa+sampat(Ʒ.nom.) + tathāgatena(ƾ.ins.) →
▼[‘(+32가지) 모습의 갖추어짐’이、 그렇게오신분에 의해]
② lakṣaṇa(ƿ. a mark, token, sign; a symptom [of a disease]; an attribute, a quality)
② sampad(Ʒ. wealth, riches; prosperity; good fortune; success, fulfillment, accomplishment)
② tathāgata(nj.ƾ.) < tathā(ƺ. in that manner, so, thus) + āgata(p.p. come, arrived)
▼[bhāṣitā] ① bhāṣitā(njp.→Ʒ.nom.) → [일컬어졌습니다.] → ~ 일컬어진 것은…
yā~ sā~ : [형용절] ‘모습의 갖추어짐’이란 어떤 그것이 여래에 의해 일컬어졌다.
+ 그것은 바로 ‘모습 아님의 갖추어짐’이 (일컬어진 것이다.) → [형용구] 여래에
의해 ‘모습의 갖추어짐’이라 일컬어진 그것은 바로 ~
② bhāṣita(p.p. spoken, said, uttered)
▼[saivālakṣaṇasampat] ① sā(Ʒ.nom.) + eva(ƺ.) + a|lakṣaṇa+sampat(Ʒ.nom.) →
▼[그것은、 실로(→바로)、 ‘(+32가지) 모습 아님의 갖추어짐’이 (+일컬어진 것입니다).”]
② eva(ƺ. indeed, truly, really; just so, exactly so truly)
출처 봉선사_범어연구소_현진스님_금강경_범어강의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能斷金剛般若波羅密多經) - 범어 텍스트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ṁ
♣K0116-001♧
♣K0117-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32일째]
어피일일법륜중 $ 032▲毘佉擔毘佉擔為 一 ● 稱量, ○□□□□,演,於,分,於
□□□□□□□, 演修多羅不可說;
於彼一一修多羅, 分別法門不可說;
□□□□□□□, 연수다라불가설;
어피일일수다라, 분별법문불가설;
於彼一一法輪中,
저러한 하나하나 법 바퀴마다
수다라 연설함도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수다라에
분별하는 법문도 말할 수 없고
[33째]
어피일일법문중 $ 033▲稱量稱量為 一 ● 一持, ○□□□□,又,於,調,或
□□□□□□□, 又說諸法不可說;
於彼一一諸法中, 調伏眾生不可說。
□□□□□□□, 우설제법불가설;
어피일일제법중, 조복중생불가설。
於彼一一法門中,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모든 법문 또 설함도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모든 법 중에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어
●K1072_T2066.txt★ ∴≪A대당서역구법고승전≫_≪K1072≫_≪T2066≫
●K1065_T2087.txt★ ∴≪A대당서역기≫_≪K1065≫_≪T2087≫
●K1398_T2156.txt★ ∴≪A대당정원속개원석교록≫_≪K1398≫_≪T2156≫
■ 암산퀴즈
847* 506
43848 / 216
■ 다라니퀴즈
구족수화길상광명대기명주총지 32 번째는?
불정광취실달다반달라비밀가타미묘장구(佛頂光聚悉怛多般怛羅秘密伽陁微妙章句) 310 번대 10개 다라니는?
부처님 108 명호 32 번째는?
32 관정(灌頂)을 증장시키며,
가라다니, 曷剌怛泥<三十二去聲>
ratna-
(이하~) 어떠한 파괴로부터도 보호해주는 이시여!
『대승대집지장십륜경』
♣0057-001♧
310 살바도란기뎨볘바 ◐薩皤突蘭枳帝弊泮<一切難過三百十>◑sarva durlaṅghinebhyaḥ phaṭ
311 살바도스타비리가시뎨볘바 ◐薩皤突瑟咤畢哩乞史帝弊泮<一切難三百十一>◑sarva dushṭaㆍprekshitebhyaḥ phaṭ
312 살바지바리볘바 ◐薩皤什皤梨弊泮<一切瘧壯熱三百十二>◑sarva jvarebhyaḥ phaṭ
313 살바아바살마려볘바 ◐薩皤阿波薩麽嚟弊泮<一切外道出三百十三>◑sarva apasmarebhyaḥ phaṭ
314 살바사라바나볘바 ◐薩婆奢羅皤拏弊泮<三百十四>◑sarva śrāvanebhyaḥ phaṭ
315 살바디리티계볘바 ◐薩嚩底㗚恥雞弊泮<三百十五>◑sarva tirthikebhyaḥ phaṭ
316 살보다바뎨볘바 ◐薩菩怛波提弊泮<一切鬼惡三百十六>◑sarvonmadebhyaḥ phaṭ
317 살바미댜 라서차려볘바 ◐薩皤微地也囉誓遮黎弊泮<一切持呪博士等三百十><七>◑sarva vidyā rājacarebhyaḥ phaṭ
318 자야가라마도가라 ◐闍耶羯囉摩度羯囉<三百十八>◑jaya-kara madhu-kara
319 살바라타사타계볘바 ◐薩婆囉他娑陁雞弊泮<一切物呪博士三百十九>◑sarva artha sādhakebhyaḥ phaṭ
●아난아,
가령 어떤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겁의 일체 가볍고 무거운 죄와
업장을 지난 세상에 참회하지 못했을지라도,
만일 이 주문을 읽고 외우고 쓰고 베껴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혹은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나 정원관사에 모신다면,
이와 같이 쌓인 업장은
끓는 물에 눈 녹듯 사라져서
오래지 않아 모두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으리라.
불정광취실달다반달라비밀가타미묘장구(佛頂光聚悉怛多般怛羅秘密伽陁微妙章句)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K0426-007♧
032
최고의 법을 원만(圓滿)하게 성취하신 이께 귀의합니다.
南無第一法圓滿
『불일백팔명찬』佛一百八名讚
♣1183-001♧
428582
203
법수_암기방안
33 종아리 [캪]calf
31 넓적다리 thigh
■ 오늘의 경전 [이야기, 게송,선시 등]
2569_0201_224243 :
대장경 내 이야기
제목 : 법사가 병석에 있을 때였다.
역경을 검교(檢校)하는 사인(使人) 허현(許玄)이 그 해 2월 3일에 황제께 이렇게 아뢰었다.
“법사는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만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2월 7일에 황제는 중어부(中御府)16) 에 조칙을 내렸다.
“의사를 보내고 약을 가지고 가서 간병하도록 하라.”
그래서 유사(有司)는 즉시 공봉의인(供奉醫人) 장덕지(張德志)와 정도(程桃)를 파견하여 약을 가지고 급히 가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렀을 때는 법사가 이미 입적했으므로 의약이 소용없었다.
이때 방주(坊州)17) 자사(刺使) 두사륜(竇師倫)이 황제에게 아뢰었다.
“법사가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슬피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며,
법사를 위해 수일 동안 조회(朝會)를 파하면서 말했다.
“짐은 나라의 보배를 잃었도다.”
당시 문무백관들 중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황제 역시 말을 마치고는 오열하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황제는 다음날 다시 군신들에게 말했다.
“애석하도다.
짐(朕)은 나라 안에서 법사 한 사람을 잃은 것이지만,
불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들보가 부러진 것이니,
4생(生)의 윤회에서 이끌어줄 스승[導師]을 잃은 것이다.
또한 망망한 고통이 바다[苦海]에서 갑자기 커다란 배가 가라앉고,
어두운 방이 아직 밝기 전에 횃불이 꺼져버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황제는 말을 마치고 나서 오열을 금하지 못했다.
그달 26일 황제가 조칙을 내렸다.
“두사륜이 상주한 바에 의하면 옥화사의 승려 현장 법사는 이미 입적하였다.
장사(葬事)에 필요한 것은 모두 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라.”
3월 6일에 또 조칙을 내렸다.
“옥화사의 현장 법사는 이미 입적하였으니,
그가 하던 경전 번역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라.
이미 번역이 완성된 것은 구례(舊例)에 따라 관에서 베껴 쓰도록 하라.
또 나머지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자은사에서 맡아서 보관하되,
잘 지켜 손실이 없게 하라.
현장의 제자나 함께 역경하던 승려로서 원래 옥화사의 승려가 아닌 자는 각기 본사(本寺)로 돌아가도록 하라.”
3월 15일에 또 조칙이 있었다.
“입적한 옥화사의 승려 현장 법사의 장례일에는 경성(京城)의 승니(僧尼)들은 번개(幡蓋)를 만들어 묘소에까지 호송하도록 하라.”
법사는 도(道)가 깊고 덕이 높아서 황제가 평소에도 대단히 사랑했기 때문에 입적한 뒤에도 거듭거듭 은혜를 내린 것이니,
옛사람에게 찾아보아도 이러한 일은 없었다.
출전:
한글대장경 K1071_T2053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당 혜립본,언종전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唐 慧立本,彥悰箋】
출처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
https://kabc.dongguk.edu/m
■요가자세 익히기
요가_선 호흡법
●세계사이트방문일자: 불기2568-11-28-목
♥Kkottongnae Hyundo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 Cheongwon County, North Chungcheong ,Korea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133
[사진]
[지도내 사진] https://maps.app.goo.gl
[거리뷰1]
[세계내-위치] https://www.google.nl
[설명 1]
[설명 2]
[동영상 1] https://youtu.be
꽃동네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동영상 2] https://www.youtube.com
[현지음악]
[위키 그림 감상]
https://en.wikipedia.org
https://www.wikiart.org

○ 2019_1106_111056_can_fix

○ 2019_1105_122549_can_BW25

○ 2019_1105_175711_can_BW25

○ 2020_0905_162945_can_ct18

○ 2020_0907_141118_can_ct14

○ 2018_1022_170829_can_ct18_s12

○ 2018_1024_173454_nik_Ar37_s12

○ 2018_1023_145936_can_Ar28_s12

○ 2020_1114_162314_can_ab46

○ 2019_1104_161615_nik_ct9_s12

○ 2019_0113_133209_nik_ct18_s12

○ 2019_0801_080500_can_ar24

○ 2019_0801_080517_can_ar3

○ 2019_0801_115607_nik_CT33_s12

○ 2019_0801_125351_nik_CT27

○ 2020_1125_125418_nik_AB4_s12

○ 2020_1125_142549_nik_AR25
● [pt op tr] fr
_M#]

○ 2020_1125_135603_can_ct9_s12
™善現智福 키워드 연결 페이지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06/keyword.html
○ [pt op tr]
● 대당서역기_K1065_T2087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
[#M_▶더보기|◀접기|
[관련키워드]
대당서역기 제4권/전체12권
■ 본 페이지 ID 정보
불기2569-02-01_대당서역기-K1065-004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5/02/2569-02-01-k1065-004.html
sfed--대당서역기_K1065_T2087.txt ☞대당서역기 제4권/전체12권
sfd8--불교단상_2569_02.txt ☞◆vtyy3632
불기2569-02-01
https://blog.naver.com/thebest007/223744615996
https://buddhism007.tistory.com/463255
htmback--불기2569-02-01_대당서역기_K1065_T2087-tis.htm
● [pt op tr] fr
_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