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함경』
K0650
T0099
제1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자료출처 불교학술원 기금 후원안내페이지
『잡아함경』 ♣0650-001♧
제1권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
★★★ 현재 페이지 분량이 많아 페이지가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분량을 다음 사이트에 압축파일로 올립니다.
https://drive.google.com/up
현재버전 [v2569-033]
● 개설서 관련 연구내용 (작성중 자료) 폴더
https://drive.google.com
[작업중파일] 보관폴더내 편집 자료파일
● 연구용 작성중 자료
[작업중파일] 편집 작성중인 자료파일
○ 불교사전학습과_수행
○ 불교개설서_연구_수행
○ 불교기초_잡아함경
○대장경 단문형태 편집 파일 https://drive.google.com
○니르바나행복론
초중고_교과서와수행
○역사
○어학
○영어
○중국어
○지구과학
○한문(불교한문)
이들 파일은 모두 작성중인 자료 파일들입니다.
이는 다음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https://drive.google.com
● 위 폴더내 파일 중 불교 개설서 관련 파일에 대한 안내
위 폴더내 파일 중 불교 개설서 관련 파일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기초 체계로 합니다.
원 파일 출처 https://cloudwater.tistory.com/221
'정해 불교학 총정리' 운수 조중현 (불기 2551년(2007)년 경서원 재발간)
위 폴더내 불교 개설서 내용은 이를 기초 바탕체계로 합니다.
그러나 원 사이트의 원래 책과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위 개설서 내용을 기초로 불교관련 공부를 하면서
대장경자료 및 불교사전 자료, 관련 단행본서적 내용 및 기타 인터넷 자료 등을 참조하며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보충하며 연구해가는 용도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수정 보완을 해가며 변경되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원저자의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때는 위에 링크된 사이트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들 폴더내 다른 자료 파일들도 모두 성격을 갖습니다.
즉,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수시로 수정 보완을 해가며 변경되는 파일입니다.
다만 연구 작업 도중의 파일 내용이더라도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들 파일 사용시는 이런 사정을 미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2569-033]
▣- 서
I
▣- 경전내용 - 『잡아함경』 1 무상경
▣■ 고려대장경 영인본
▣■ 고려대장경 판본
▣■ 팔리본
▣■ 영어번역본
▣■ 요약-
▣○ 정관과 염리의 관계
▣○ 경전내용 요약
▣○ 5온과 현상의 범주
▣○ 불교의 기본적 진리
▣○ 일체에 공통된 내용
▣○ 개인적인 삶의 기본목표
▣○ 5온과 무상ㆍ고ㆍ공에 대한 의문내용
▣- 법문의 이해와 실천 수행의 순서
▣- 수행과 법문의 이해
▣○ 생사고통과 현실의 정체 이해
▣○ 일반적 입장에서 수행에 들어가는 기본 계기
▣- 기초적으로 세속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 고통의 임시적 제거와 근본적 제거 방안
▣- 좁고 짧고 얕은 관찰과 넓고 길고 깊은 관찰
▣- 넒고 길고 깊은 관찰에 바탕한 좋음
▣- 소원과 서원의 가치
▣- 좁고 짧고 얕은 관찰에 바탕한 가치판단의 문제점
▣- 당장 외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
▣- 각 주체의 내면 내용
▣- 초점 외 잠재된 내용
▣- 당장의 감각, 느낌에 치중
▣- 인과에 대한 무지
▣- 시장가격에 의한 판단
▣- 실질 가치 및 효용과 시장가격
▣- 눈에 보이지 않은 수익과 비용
▣-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
▣-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의 화폐가치 환산
▣- 화폐의 실질 가치와 시장가격
▣- 쓰레기와 보물
▣- 수행으로의 전환 계기
▣- 생사고통이 없음의 가치
▣- 고려하는 기간의 문제
▣- 장기간에 걸친 인과 판단
▣-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다른 생명들의 주관적 평가 )
▣- 단멸관과 수행
▣- 단멸관의 제거의 어려움과 믿음의 중요성
▣○ 종교 일반의 현실부정 공상주의적 이상성과 불교
▣-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입장
▣- 생사과정에서 수행의 가치
▣- 가치의 유지기간과 수행을 통해 얻는 자산
▣-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갖기
▣- 수행의 여러 단계와 생사 고통 제거 방안
▣- 장래 결과 발생 원인제거
▣- 이미 발생한 고통에 대한 대처 방안
▣- 원래의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추가 노력
▣- 과거에 쌓여진 업장의 추가제거
▣- 고통의 제거 순서 - 예방의 중요성
▣- 수행의 최초 진입 - 인천교적인 방안
▣- 인천교와 10선법
▣- 생사묶임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예비단계
▣- 외범으로서 3현
▣- 5정심관
▣- 관신부정觀身不淨
▣- 관수시고觀受是苦
▣- 관심무상觀心無常
▣- 관법무아觀法無我
▣- 불교내 수행 예비단계 (난ㆍ정ㆍ인ㆍ세제일 4선근위)
▣- 고제(苦諦)의 4행상 [비상非常ㆍ고苦ㆍ공空ㆍ비아非我]
▣- 고집제(苦集諦)의 4행상 [인因ㆍ집集ㆍ생生ㆍ연緣]
▣- 고멸제(苦滅諦)의 4행상 [멸滅ㆍ정靜ㆍ묘妙ㆍ리離]
▣- 도제(苦滅道諦)의 4행상 [도道ㆍ여如ㆍ행行ㆍ출出]
▣-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의 필요성- 생사고통의 제거
▣○ 생사현실의 생사고통 [고제苦諦]
▣○ 생사고통을 겪는 원인 [고집제]
▣- 욕계의 소원의 성취 과정의 문제
▣-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
▣-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신견身見]
▣- 영원함과 단멸관을 취함 [변견邊見]
▣- 탐ㆍ진ㆍ치ㆍ만 [미사혹, 수혹]
▣- 잘못된 인과 판단 문제 [사견邪見]
▣- 현실에 대한 온갖 잘못된 이해 [견취견見取見]
▣- 계금취견戒禁取見
▣-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의심 [의疑]
▣- 현실을 진짜이며 실답다고 여기는 자세의 문제
▣- 생사현실을 참된 진짜이고, 실답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정
▣- 풍부하게 중첩해 현실 내용을 얻음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킴
▣- 현실 내용을 외부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함
▣- 감각현실의 각 부분의 특성이 달라 그 실재가 있다고 여김
▣- 다수가 일정 내용을 반복 경험하기에 그 실재가 있다고 여김
▣- 본바탕 실재에 대한 다양한 잘못된 이해
▣- 참된 진짜 뼈대가 있기에 현실 내용을 얻는다고 잘못 분별함 [실체설]
▣○ 수행의 목표점 [고멸제]
▣- 근본적인 고의 제거방안 [자성청정열반, 유여의열반, 무여의열반, 무주처열반]
▣- 유여의열반
▣- 무여의열반 [회신멸지]
▣- 본래 자성청정열반
▣- 생사현실 안에서 '자성청정열반'에 대한 이해가 갖는 의미 - <생사 즉 열반>
▣- 중생제도를 위한 방안 [무주처열반]
▣○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들 [고멸도제]
▣- 본 수행
▣- 37 도품
▣- 4념처
▣- 4정단
▣- 4여의족
▣- 5근
▣- 5력
▣- 7각지
▣- 8정도
▣- 정견(正見)
▣- 정사유
▣- 정어
▣- 정업
▣- 정명
▣- 정정진
▣- 정념
▣- 정정
▣- 계ㆍ정ㆍ혜 3학을 통한 번뇌의 근본제거
▣- 기본적인 계의 덕목의 성취
▣- 본성적인 계와 차계
▣- 10선법과 계와 율의 관계
▣- 계와 율의 구분
▣-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에서의 계율
▣- 5계
▣- 8관재계
▣- 사미 사미니 10계
▣- 대승보살의 10중계(十重戒)
▣- 정(定: 삼매)
▣- 삼매의 공덕
▣- 삼매 수행의 내용
▣- 8해탈
▣- 8승처
▣- 10변처
▣- 3삼매
▣- 공삼매
▣- 무상삼매
▣- 무원삼매
▣- 4무량심
▣- 제불현전삼매
▣- 다양한 삼매
▣- 삼매의 단계
▣- 색계 4선
▣- 초선(初禪)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
▣- 2선(二禪)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
▣- 3선(三禪)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
▣- 4선(四禪) 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
▣- 심(尋)과 사(伺)의 유무에 따른 분류
▣- 현법락주
▣- 무색계 4선
▣- 멸진정과 9차제정
▣- 사자분신삼매와 초월삼매
▣- 삼매의 다양한 표현
▣- samādhi
▣- cittaikāgratā
▣- samāhita
▣- samāpatti
▣- śamatha
▣- dhyāna
▣- dṛṣṭa-dharma-sukha-vihāra
▣- 삼매로 분별 및 수ㆍ상ㆍ행ㆍ식을 제거해가는 사정
▣- 세계의 의미와 욕계 색계 무색계
▣- 망집과 욕계
▣- 욕계의 망상분별과 3 악도의 생사고통
▣- 욕계의 산란 상태
▣- 욕계에서 초점 밖 영역
▣- 욕계의 심일경성 단계
▣- 색계 삼매
▣- 무색계 삼매
▣- 색계 무색계와 궁극적 수행목표
▣- 생득정과 해탈
▣- 중생 제도와 욕계를 택하는 사정
▣- 지혜를 통한 근본적 번뇌 제거
▣- 의심의 제거
▣- 계금취견의 제거
▣- 신견의 제거
▣- 변견의 제거(상견과 단견의 제거)
▣- 상견과 단견을 취하게 되는 배경사정
▣- 상견과 단견의 제거방안
▣- 무상ㆍ고ㆍ무아ㆍ부정을 기초적으로 제시하는 사정
▣- 2분법상의 유무 분별과 망집
▣- 2분법상의 상단 분별과 망집
▣- 2분법상의 생멸 분별과 망집
▣- 언설로 표현한 제일의제와 망집
▣- 14무기와 망집
▣- 상대의 입장에 맞춘 망집제거 방편
▣- 망집에 바탕한 62견
▣- 현실의 유무분별과 망집
▣- 유무판단의 논의 취지 - 실다움 여부의 판단
▣- 실답지 않음의 판단
▣- 다양한 유무판단
▣- 존재가 문제되는 다양한 영역
▣- 일반적 입장에서의 유무 문제
▣- 관념에 대응하는 감각현실 유무문제
▣- 관념으로 감각현실을 찾아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 감각현실을 먼저 대한 후 유무 판단하는 경우
▣- 일반적 유무판단시 유무 양변을 모두 떠나야 한다는 입장
▣- 망상분별 부분이 논의핵심이 되는 사정
▣- 일반적인 유무판단과 망상분별
▣-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 아상(我相)[자신에 대한 상]
▣- 아(我)의 유무 논의의 효용
▣- 생멸 및 왕래에 대한 상
▣- 감각현실에 대응하지 않은 관념의 현실 유무 문제
▣- 실재 영역과 관련한 유무 문제
▣- 실재의 유무 논의와 생사고통
▣- 실체의 유무 문제
▣- 실다운 진짜를 찾는 사정
▣- 무아ㆍ무자성과 실재의 공함의 관계
▣- 현실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유무논의
▣- 관념 영역에서 관념의 유무 문제
▣- 관념영역에서 관념이 얻어지는가 여부의 문제
▣- 유무 논의의 성격 혼동 문제
▣- 실체의 존부 문제와 관념의 존부문제의 혼동
▣- 관념적 차원에서 유무 문제들
▣- 관념영역에 관념이 현재 머물고 있는가의 문제
▣- 수학문제에서 답의 '유무' 논의
▣- 수학문제를 풀수 있는가 여부의 유무논의
▣- 과거에 기억한 관념의 현재 존부문제
▣- 연상되어지는 일정한 관념내용의 유무
▣- 감각현실에 대응한 관념의 존부 문제
▣- 감각현실 자체를 잘 얻지 못하는 경우
▣- 감각현실 자체는 잘 얻는 경우
▣- 언어 영역에서 언어의 유무 문제
▣- 언어 시설의 문제
▣- 언어 시설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키는 경우
▣- 법처소섭색[감각할 가능성으로서 유무판단]
▣- 극략색
▣- 극형색
▣- 수소인색
▣- 변계소기색
▣- 자재소생색
▣-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유무판단문제
▣- 내부 내용
▣- 장애물로 가려진 내용
▣- 먼 곳의 내용
▣- 감각에 필요한 요소 조건 등이 결여된 기타 여러 상황
▣- 다른 감각현실
▣- 다른 생명체의 다른 감관이 얻는 내용들
▣- 기계적 센서를 통해 얻어지는 내용
▣- 수행을 통한 6 신통등
▣- 공간의 유무문제
▣- 마음의 유무
▣- 마음의 시설
▣- 마음의 실다움과 다른 영역과의 관계
▣- 마음과 실재의 혼동과 구분
▣- 언어표현에서의 혼동 정리
▣- 있고 없음의 판단에서 각 영역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형식
▣- 유무논의와 상단 논의를 통한 수행의 방향
▣- 사견의 제거
▣- 인과의 올바른 파악 [지혜]
▣- 견취견의 제거
▣- 탐ㆍ만ㆍ진ㆍ무명의 근본제거 - 수도
▣- 탐욕과 분노에 대한 집착의 제거
▣- 어리석음의 제거
▣- 만(慢)의 제거
▣- 번뇌를 끊어가는 수행단계 3도- 4향4과
▣- 수행을 통해 끊어야 할 번뇌의 구분
▣- 견혹
▣- 수혹
▣- 수번뇌
▣- 대수혹(대번뇌지법)
▣- 불신(不信)
▣- 해태(懈怠)
▣- 방일(放逸)
▣- 혼침(惛沈)
▣- 도거(掉擧)
▣- 산란(散亂)
▣- 실념(失念)
▣- 부정지(不正知)
▣- 치(癡)
▣- 중수혹(대불선지법)
▣- 무참(無慚)ㆍ무괴(無愧)
▣- 소수혹(소번뇌지법)
▣- 간(慳)
▣- 교(憍)
▣- 질(嫉)
▣- 한(恨)
▣- 분(忿)
▣- 해(害)
▣- 뇌(惱)
▣- 부(覆)
▣- 첨(諂)
▣- 광(誑)
▣- 근본번뇌의 수행단계별 분류
▣- 수행의 3도-견도ㆍ수도ㆍ무학도
▣- 4향4과
▣- 예류향
▣- 예류과
▣- 일래향
▣- 일래과
▣- 불환향
▣- 불환과
▣- 아라한향
▣- 아라한과
▣- 아라한과 대승 보살의 수행[<생사 즉 열반관>]
▣- 업과 집착의 기본적 제거
▣- 자신에 대한 잘못된 분별과 집착의 제거[아집(我執) 번뇌장(煩惱障)의 제거]
▣- 일반 현실에 대한 잘못된 분별과 집착[법집(法執), 소지장(所知障)]
▣- 자신과 근본정신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외부 세상에 대한 잘못된 분별제거
▣- 잘못된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올바로 찾기
▣- 생사현실 일체에 대한 부정과 긍정 - <생사 즉 열반>의 이론적 이해
▣- 생사현실내 안인성취와 <생사 즉 열반>의 실증
▣- 잘못된 악취 공견의 제거
▣- 무량행문을 통한 무량 방편지혜 구족과 중생제도
▣- 보살수행과 바라밀다
▣-보시(布施, dāna-pāramitā)
▣-정계(淨戒, 지계持戒, śīla-pāramitā)
▣-안인(安忍, 인욕忍辱, kṣānti-pāramitā)
▣-정진(精進, virya-pāramitā)
▣-정려(靜慮, 선정禪定, dhyāna-pāramitā)
▣-반야(般若, prajñā-pāramitā)
▣-방편(方便, upāya-pāramitā)
▣-원(願, praṇidhāna-pāramitā)
▣-력(力, bala-pāramitā)
▣-지(智, jñāna-pāramitā)
II
▣●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의미
▣- 일체를 분류하는 여러 방식과 5온
▣-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총괄적 의미
▣- 넓은 의미의 색과 좁은 의미의 색
▣- 수의 의미
▣- 상의 의미
▣- 행의 의미
▣- 식의 의미
▣- 식의 다양한 의미
▣- 마음작용에서 기관ㆍ작용ㆍ결과내용의 구분
▣●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 분류의 의미
▣- 현실 일체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5온
▣- 자신의 구성요소로서 5온
▣- 평소 눈을 떠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의 정체
▣- 좁은 의미의 색
▣- 넓은 의미의 색(감각현실) 가운데 일부
▣- 자신이 얻어낸 내용 (마음 내용)
▣- 5온과 자기자신의 관계
▣- '색'이란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
▣- '색'은 자신의 몸이 아니다.
▣- 현실에서 자기자신으로 보는 내용의 검토
▣- 상일성
▣- 주재성
▣- 대상에 대한 주관
▣- 색의 일부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배경 - 구생기신견
▣- 잘못된 신견의 방치와 생사고통의 문제
▣- 분별기 신견이 잘못인 사정
▣- 얻어진 내용안에 '그 내용을 얻는 주체'가 있을 수는 없다.
▣- 관념은 감각현실 등 다른 영역에 얻을 수 없다.
▣- 본바탕인 실재에서 얻을 수 없는 내용이다.
▣- 참된 진짜 실체가 아니다.
▣- 자신의 부분이 갖는다고 여기는 특성이 있다. - 이는 잘못 파악한 내용이다.
▣- 상일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다.
▣- 자신 뜻대로 주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자신의 감관이 위치한 부분이 사실은 아니다.
▣- 색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 - 그림을 통한 설명
▣- 다른 이가 감각하는 과정의 관찰
▣- 다른 이가 감각하는 내용은 다른 이 내부의 변화다.
▣-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 - 이 부분은 자신이 아니다.
▣- 실질적 자신으로 보아야 할 부분
▣- 공통 요소
▣- 유사성
▣- 인과관계 전후 연결성
▣- 변화과정에 계속 존재하는 내용을 찾아내기
▣-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의 시설 문제
▣-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와 실질적 자신의 시설
▣- 자신의 현상적 본 정체성 - 정신과 육체
▣- 실질적인 자신과 현상적 자신의 관계
▣- 다른 이로 여기는 부분 - 이 부분은 다른 이가 아니다.
▣- 자신이 다른 이 철수로 보는 부분- 이는 철수의 외부 실재가 아니다.
▣- 자신 외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
▣- 다른 이의 외부에 대한 판단
▣- 다른 이 철수가 행하는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
▣- 다른 이의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의 검토
▣- 다른 이 철수가 또 다른 이와 관련해 행하는 판단
▣- 다른 이 철수가 또 다른 이와 관련해 행하는 판단의 검토
▣- 자신의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 검토
▣- 자신의 다른 이가 대하는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 검토
▣- 외부 세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의 제거
▣- 감각과정 및 동작시 주관과 대상의 인과 관계 문제
▣- 현실에서 운동의 인과관계
▣- 감각현실이 객관적 실재가 아닌 사정
▣- 감각현실이 다수에게 일정한 관계로 반복 파악되는 사정
▣- 색은 객관적 실재 대상이 아니다.
▣- 감각현실은 실재 대상이 아니다.
▣- 관념적 내용은 외부 실재 대상이 아니다.
▣- 다른 주체가 얻는 감각현실은 실재대상이 아니다.
▣- 마음은 실재가 아니다.
▣- 실재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색은 정신내용이다. - 정신밖 외부 물질이 아니다.
▣- 물질과 색의 표현의 의미 차이
▣- 색은 물질이 아니다 - 논의효용1- 근본 정신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단멸관의 제거
▣- 색은 물질이 아니다 - 논의효용2- 정신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집착의 제거
▣- 색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성격 지위
▣- 색이라고 표현할 경우의 의미
▣- 색과 수ㆍ상ㆍ행ㆍ식과의 차이
▣- 색과 수ㆍ상ㆍ행ㆍ식의 공통성
▣- 색은 정신영역 안의 내용이다.
▣- 색을 물질이라고 표현할 경우의 의미
▣- 물질개념1 - 느낌, 분별 등 정신적 내용과 다른 특성을 갖는 내용
▣- 물질개념2 - 정신영역과 떨어진 내용
▣- 색이 갖는 물질적 측면
▣- 감각현실이 물질적 특성을 갖는 사정
▣- 색이 물질과 다른 측면
▣- '감각 과정'을 물질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 - 생리학자의 입장
▣- 생리학자의 입장이 잘못인 사정
▣- 몸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 자신이 얻는 내용물이 담기는 그릇(~정신)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 다른 사람이 얻는 내용물 그릇(~정신)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 다른 사람이 행하는 다른 사람 자신에 대한 판단
▣-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그릇(~정신)에 대해 행하는 잘못된 판단
▣- 다른 사람 철수가 행하는 판단들의 검토
▣- 자신이 행하는 그릇(~정신)의 위치에 대한 판단의 검토
▣- 그릇(~정신)의 위치는 한 주체가 얻는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 그릇(~정신)과 실재의 문제
▣- 그릇(~정신)에 대한 실험관찰의 곤란성
▣- 감각작용은 물질적인 변화과정에 준하지 않는다.
▣- 감각현실과 얻어진 다른 내용의 공통점
▣- 정신적 그릇의 작용에 대한 실재 영역 추리
▣- 정신과 육체의 관계
▣- 5 온의 분류와 물질정신의 분류 차이
▣○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분류가 갖는 의미차이
▣● 일체를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보는 근거
▣- 일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진리 (5법인)의 성격
▣- 망집에 바탕한 희망과 일치하지 않는 5법인
▣- 권위적 판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
▣- 합리적 판단에 의한 이해
▣○ 현상 일체가 영원하지 않다고 제시하는 근거
▣○ 일체의 본바탕 실재
▣- 현실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본바탕 실재의 문제
▣- 실재내용과 감각내용의 관계
▣- 실재를 찾는 문제
▣○ 감각현실과 실재내용의 관계
▣○ 비아, 또는 무아, 무자성 판단 문제
▣- 논의의 실익 문제
▣- 실체없음과 실재의 공함의 관계
▣● 무상ㆍ고ㆍ공ㆍ비아를 근거로 싫어하여 떠날 이유
▣○ 마음의 해탈(심해탈)의 효용
▣- 생사고통의 예방과 원인의 제거
▣- 생사고통을 받는 과정
▣- 가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 잘못된 희망의 잘못된 방안을 통한 추구
▣- 집착이 불러 일으키는 고통의 모습
▣- 현실에서 가치없는 것에 대한 집착의 제거
▣- 집착의 근원- 자신과 생명 등
▣- 생사고통의 원인으로서 집착
▣-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 수행목표와 수행방편에 대한 집착의 제거
▣● 무상ㆍ고ㆍ공과 수행목표
▣● 해탈지견의 내용
▣○ 해탈과 단견의 차이
▣○ 윤회
▣○ 윤회와 삶의 목표
▣- 윤회의 증명 문제
▣● 수행목표 상태와 일반 상태의 차이점
▣- 수행의 어려움과 수행의 가치의 인식 필요성
▣-수행의 목표의 가치
▣- 수행의 현실에서의 가치
▣- 윤회를 전제로 한 수행의 가치
▣● 무상ㆍ고ㆍ공ㆍ비아와 수행목표 상태의 관계
▣○ 무상, 고와 수행목표로서 해탈과 열반의 성격
▣- 무상한 것은 왜 고통인가?
▣- 현실을 모두 즐거움으로 본다는 반대 주장
▣- 비관주의와 불교의 차이
▣○ 일반의 경우와 불교의 목표의 차이
▣- 인과상 나쁨의 결과를 가져오는 좋음
▣- 좋음을 얻는 기간의 문제
▣- 일시적인 좋음의 문제
▣- 고통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문제
▣-고통과 열반의 관계- 생멸 즉 고통이 없어진 상태로서의 열반
▣- 생멸을 멸하는 방안 - 회신멸지의 니르바나
▣○ 회신멸지(灰身滅智) 니르바나의 문제점
▣- 일반인의 입장에서의 문제점
▣- 수행자 입장에서 회신멸지 상태의 문제점
▣○ <생사 즉 열반관>과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
▣- <생사 즉 열반>의 근거1
▣- <생사 즉 열반>의 근거2
▣- <생사 즉 열반>의 근거3
▣- <생사 즉 열반>의 근거4
▣- <열반 즉 생사>와 <생사 즉 열반>의 관계
▣○ 생사현실에 생멸을 본래 얻을 수 없음
▣- 3가지 존재영역 - 원성실상ㆍ의타기상ㆍ변계소집상
▣- 원성실상과 승의무자성
▣- 의타기상과 생무자성
▣- 변계소집상과 상무자성
▣- 유무극단을 떠난 3성 3무성의 관계
▣- 3무성과 생사현실의 실답지 않음
▣- 3무성과 <생사 즉 열반>
▣- <생사 즉 열반>과 수행의 필요성
▣- 관념이 실답지 않은 사정 - 환자와 가족의 비유를 통한 이해
▣○ 열반과 다양한 수행목표 선택 문제
▣-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과 <생사 즉 열반>
▣- 생사고통의 해결과 꿈의 비유
▣○ <생사 즉 열반>에서의 문제점
▣- 현실 그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함
▣- 망집에 바탕한 단순한 낙관주의
▣- 수행중 망상분별과 집착 상태로 다시 물러남[퇴전]
▣- 안인 수행과 지나친 고행주의
▣- <생사 즉 열반관>으로 없음에 치우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잘못
▣- <생사 즉 열반관>으로 개인의 해탈에 안주하고 중생제도를 외면함
▣- 집착이 없으면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악취공견)
▣-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방안
▣- <생사 즉 열반>의 2 중적인 측면- 현실 긍정과 부정
▣○ 현실부정적인 측면 - 깨끗하지 못한 현실의 부정
▣○ 현실긍정적인 측면 - 깨끗한 형태로 현실의 긍정
▣○ 윤리적 이상추구 실천행의 측면
▣-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과 생사윤회 [변역생사]
▣- 무상한 현실내 수행의 의미 - 현실 부정과 현실 긍정과 이상추구
▣- 공, 비아와 수행목표의 관계
▣- 생사현실에서 공의 이해가 갖는 효용과 본바탕의 관계
▣● 수행목표와 염리, 희탐진
▣● 수행의 근거
▣- 수행에 대한 집착 제거 필요성
▣- 기본적 수행방안
<부록>
▣○ 경전의 불설 비불설 논의
▣- 경전 전파 경로와 원본 문제
▣- 분량의 장단과 원본 문제
▣- 다양한 설법 방식과 원본 문제
▣- 다양한 전파 번역 과정과 원본 문제
▣- 깨달음을 주는 소재로서 경전의 가치
▣- 마침
###
>>>
♥Table of Contents
▣- 서
일반인 입장에서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개글을 적어보고자 한다.
이런 노력은 본 연구원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대부분 일반적 입장에서 <현실의 삶>에 임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음>을 구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좀 더 좋은 내용>을 찾아 삶에서 노력해가게 된다.
본인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본인도 오랜 기간 <상식적 입장>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다가 처음 젊은 시절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이 옳고 올바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가치가 높은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어떤 내용이 과연 <한 생>을 바쳐 <추구할 만한 일인가>도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면, 다시 <그것을 성취할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인과관계>도 살펴보게 된다.
그런데 <진리나 가치>, <삶의 목표와 그 실현 방안>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벌려 놓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불교서적을 처음 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문제와 관련하여 불교는 <일반적 입장과 다른 내용>을 많이 제시함을 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처음 우연히 <반야경전)이나 <중론송>을 대했던 일이 떠오른다.
당시 내용을 들춰 보며 도대체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기 힘들었다.
그외에도 불교 내용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이후 틈틈히 시간을 내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 가진 의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
<처음 삶에 대해 가졌던 의문>이나 <핵심적 주제>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간 <다양한 내용>을 이와 관련해 살펴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결국 <불교에서 소개한 내용>이 <가장 옳고 올바른 내용>임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다음 생각을 하게 된다.
만일 처음부터 <불교 가르침을 쉽게 소개하는 글>을 먼저 만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공연히 <엉뚱한 내용>들을 붙잡고 <시간과 노력>을 오래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방향을 올바로 찾아 <수행>을 잘 성취할 수 있었을 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음처럼 가르친다.
망집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생사윤회>를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생에 <수행>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또 <다음 생>에서도 같은 노력을 되풀이 해야 한다.
그래서 매번 <이번 생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상황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또 올바로 잘 찾아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불교 소개글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장래 다음 생의 본 연구원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다음 생은 되도록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번 생>에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본 연구원은 <법화경>이나 <반야경> 등으로 먼저 불교를 대했다.
그러나 나중에 <불교>를 전공으로 연구할 때는, <아함경 >을 통해 불교 기본 내용들을 익혔다.
그 가운데 『잡아함경』이 기본 불교 내용을 익히는데 도음이 많이 되었다.
『잡아함경』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기본적 내용>이 된다.
그래서 처음 불교를 대하는 이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본연구원도 이를 통해 <불교의 기본적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 생>에도 <불교 기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곧바로 <수행>에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나중에 <불교>를 전공으로 삼아 공부한 이후, 십여년 지난 무렵, 처음 작성하였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런 가운데 내용이나 편집 방식의 변경이 잦다.
매번 글을 대할 때마다 보완할 부분이 새로 눈에 띈다.
그리고 표현도 수정하게 된다.
처음에는 글을 만연체로 썼었다.
한국어는 <한 단어를 꾸미는 말>을 <앞에 길게 붙이는 경우>가 많다.
문법상 <관형구)라고 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문장이 길게 된다.
한편 각 문장을 <연결사>를 통해 길게 적을 수도 있다.
~하고 ~하면서, 이런 형태로 길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만연체>로 적는 경우라고 하자.
이런 경우, 쓰는 입장은 편하다.
<관련 내용>을 모두 한 문장에 함께 넣어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장 각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도 한 문장 속에 함께 넣게 된다.
또 문장과 문장을 <접속사>로 이어 길게 붙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읽는 입장에서는 문장의 <뜻>을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그런데 만연체로 쓴 글들은, <글을 쓴 본인>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문장들을 짧게 끊어 표현을 다시 바꾸게 된다.
특히 <조건절>과 <귀결절>을 서로 분리해보게 된다.
조건절과 귀결절을 함께 묶으면, 우선 문장도 길어진다.
그리고 <전제>와 <결론>의 관계성을 바로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오히려 문장을 짧게 끊기에, 이해하기 더 힘들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문장을 어떻게 끊어 읽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혼동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 마음에 위치한다> 고 생각한다.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 마음에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어떻게 묶고 어떻게 끊어 읽는가>에 따라 의미가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
새버전에서는 문장 중에서 <하나로 묶일부분>이나 <강조할 부분>을 < > 형태로 묶어 표시하기로 한다.
이는 <해당 부분>을 하나의 명칭이나 단어 a처럼 묶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묶어 표시하면 문장 가운데 <강조되는 부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 혼동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방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문장 안에 < >기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읽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표현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즘은 출판을 고려하지 않고 글을 작성후 웹 페이지에 올린다.
그런데 웹상에서는 <종이 책>처럼 글을 대하게 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각 페이지>별로 <각 주제>를 독립해 대하게 된다.
즉 <각 페이지>가 매번 첫 페이지처럼 된다.
이런 경우 <이전에 적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 서술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각 페이지마다 내용을 독립적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사정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링크를 걸어 <중복 서술>을 피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부분의 서술>과 전체적 연결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매번 조금씩 <내용 및 표현 >의 수정 보완을 반복하게 된다.
만일 완전한 만족을 얻으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앞으로도 몇 생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생에서도 이런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정 보완할 내용>이 발견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때 그 때 수정해나갈 생각이다.
웹 상에 올리는 글이다.
그래서 수정 보완은 비교적 쉽다.
그런데 이 경우 판본 번호를 통해 수정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정 작업시마다 판본번호를 붙여 나가기로 한다.
다만 <아주 작은 부분>만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주번호에-<부기번호)를 붙여 표시하기로 한다.
한편 웹 사이트 자체도 그간 변동이 많았다.
<처음에 이용한 사이트>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후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전전하며 이용하게 된다.
요즘은 편의상 이 가운데 한 사이트를 <주된 편집 사이트>로 정해 작업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에는 편집 최종파일만 단순히 붙여 올려 놓는다.
일단 아래에 <그간 웹 사이트 변경 내역>을 붙여 놓기로 한 l다.
***
요즘 케이팝 데몬 헌터라는 이상한 영화가 요즘 인기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보았다
참고 K-pop demon hunter 에 대한 외국반응
https://youtu.be/4QjDp4spLfM?si=pFYDwxKMIG21_d-H
왜 이런 만화 영화가 인기를 끄는 것일까
스토리 진행을 지루하지 않게 사이사이 음악이 들어가 있다.
물론 스토리는 만화이므로 허무맹랑하다.
음악으로 혼문이라는 문을 완성해서 악마를 퇴치한다.
이런 내용이다.
생각해 보면 연구 생활에 음악이 영향이 많다
연구를 혼자 하다 보면 조금 지칠 때가 많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주로 외국 노래를 많이 듣는다
여기에는 나름 사정이 있다
처음에는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연구를 했다
그런데 한국 노래를 들으면 노래 가사가 들린다
그것이 연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노래는 노래 가사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외국 노래를 들으면서 연구를 하려고 생각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 상으로 여러 노래를 테스트 해 보았다.
그런데 어떤 나라 노래는 싸우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러다가 불어 노래를 들으니 조금 연구가 잘 되는 듯 했다.
당시 처음 들었던 불어 노래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불어 노래는 감상시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수행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전해 주는 듯하다.
불어가 佛語라고 표기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요즘도 비슷하다.
개설서 파일을 편집하다 보면 골치가 아파온다.
쉽고 재미있게 편집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현재 편집하는 파일들은 언제 편집 작업이 끝날지 기약하기 힘들다.
문제는 내용이 딱딱하다.
그래서 볼 때마다 골치가 아프다
그리고 편집 수정 보충 작업이 숙제처럼 여겨진다.
이런 현상이 문제다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보려고 한다.
그래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이번에 본 만화 영화처럼 중간중간에 들리는 노래를 같이 끼워 놓는다.
그러면서 파일을 살피고 편집을 하면 어떨까.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편집이 완료된다고 하자.
그리고 노래는 불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부분만 빼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편집 파일 전체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2569-08-29)
-----------
현재 주 사이트
SINCE 불기2565-03-19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
-----------
이하 보조 사이트
SINCE 불기2565-03-19 https://blog.naver.com/thebest007/222280859486
-----------
이하 업데이트 중단 : 불기2566-09-11 이후 중단 ( 편집상 문제로 기존파일 단순보관 사이트 )
SINCE 불기2566-09-03 https://reality007.tistory.com/17
SINCE 불기2565-04-22 https://thebest007.tistory.com/627
SINCE 불기2554-11-25 https://buddhism007.tistory.com/228
-----------
이하 없어진 사이트
(2022.09 ) SINCE 불기2566-09-11 http://buddhism.egloos.com/6944111
(2022.09 ) https://blog.daum.net/thebest007/627
(2012.07 ) http ://blog.paran.com/buddhism007/41677206
-----------
● = 논의부분 표시
♥Table of Contents
▣- 경전내용 - 『잡아함경』 1 무상경
0001. 무상경(無常經)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2)에 계셨다.
그 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色)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은 바른 관찰[正觀]이니라.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고 하자.
그러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심해탈(心解脫)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니라.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고 하자.
그러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심해탈(心解脫)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비구들아,
마음이 해탈한 사람이
만일 스스로 증득하고자 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스스로 증득할 수 있다.
이른바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
범행은 이미 섰다.
할 일은 이미 마쳤다.
그리고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무상하다[無常]'고 관찰한 것과 같이,
'그것들은 괴로움[苦]이요,
공하며[空],
나가 아니다[非我]'3)라고 관찰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 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 고려대장경에는 경명(經名)이 없다.
편의상 경 안에 있는 온타남과 경의 내용을 의거하여 경명을 붙였다.
2)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도량의 하나이다.
수달다(須達多) 장자가 기타(祇陀) 태자(太子)에게 토지를 산다.
그래서 정사를 짓는다.
그래서 부처님께 보시한다.
그러자 기타 태자도 그 동산의 숲을 부처님께 보시하였다.
수달다 장자는 항상 <가난하고 외롭게 사는 이들>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급고독 장자라 불렸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수급고독원이라 하였다.
3) 7번째 소경인 <어색희락경> 말미의 올타남(嗢拕南)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5온의 무상(無常) 외에도, 고(苦)ㆍ공(空)ㆍ비아(非我)를 관찰한다.
이러한 것이 낱낱의 소경으로 분류되어 있다.
♥Table of Contents
▣■ 고려대장경 영인본

○ [그림] 08pfl--image\Pitaka-K0650V18P0707a.jpg
♥Table of Contents
▣■ 고려대장경 판본
K0650V18P0707a03L;
如是我聞一時佛住舍衛國祇樹給
孤獨園爾時世尊告諸比丘當觀色
無常如是觀者則爲正觀正觀者則
生厭離厭離者喜貪盡喜貪盡者說
心解脫如是觀受想行識無常如是
觀者則爲正觀正觀者則生厭離厭
離者喜貪盡喜貪盡者說心解脫如
是比丘心解脫者若欲自證則能自
證我生已盡梵行已立所作已作自
知不受後有如觀無常苦空非我亦
復如是時諸比丘聞佛所說歡喜奉行
『잡아함경』(신수, 2. p.001a)
1. 무상경
신수장경 : 2-1a
한글장경 : 잡-1-1
남전장경 : s.22.12~14
팔리어본, 산스크리트본, 독일어본, 영역본, 참조 https://suttacentral.net/
♥Table of Contents
▣■ 팔리본
s.22.12~14
https://suttacentral.net/sn22.12/pi#12-14
12. Aniccasutta
MS SC
Evaṃ me sutaṃ— sāvatthiyaṃ.
Tatra kho … pe …
“rūpaṃ, bhikkhave,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ṅ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Evaṃ passaṃ, bhikkhave, sutavā ariyasāvako
rūpasmimpi nibbindati, vedanāyapi nibbindati, saññāyapi nibbindati,
saṅkhāresupi nibbindati, viññāṇasmimpi nibbindati.
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i.
Vimuttasmiṃ vimuttamiti ñāṇaṃ hoti.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pajānātī”ti.
Paṭhamaṃ
♥Table of Contents
▣■ 영어번역본
https://suttacentral.net/sn22.12/en
Thus have I heard.
At Savatthi…. There the Blessed One said this:
“SC Bhikkhus,
form is impermanent,
feeling is impermanent,
perception is impermanent,
volitional formations are impermanent,
consciousness is impermanent.
Seeing thus, bhikkhus, the instructed noble disciple experiences revulsion
towards form, revulsion towards feeling, revulsion towards perception,
revulsion towards volitional formations,
revulsion towards consciousness.
Experiencing revulsion, he becomes dispassionate.
Through dispassion his mind is liberated.
When it is liberated there comes the knowledge:
‘It’s liberated.’ He understands:
‘Destroyed is birth, the holy life has been lived,
what had to be done has been done,
there is no more for this state of being.
♥Table of Contents
▣■ 요약-
현상의 일체 즉 5온(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공하다.
그리고 <나>가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바른 관찰이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상 일체 5온>에 대한 기쁨과 탐욕을 끊는다.
그리고 심해탈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해탈지견을 얻는다.
========
♥Table of Contents
▣○ 정관과 염리의 관계
『잡아함경』 0001. 무상경(無常經)은 짧다.
이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즉, 근본적 진리판단과 수행 목표와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 경전내용 요약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1 현실 일체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이다.
이런 내용이 <무상ㆍ고ㆍ공ㆍ비아 >(無常,苦,空,非我)인 사실을 보라.
1 이렇게 보면 올바로 진리를 보는 것이다. [정관]
1 이렇게 올바로 본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삶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 이들을 싫어하여 떠나야 한다. [염리]
그리고 즐거워함과 탐욕을 다해야 한다. [희탐진]
=> 그래서 마음이 <번뇌에 묶인 상태 >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심해탈]
=> 그러면 <해탈상태로서 바라보는 세계관>을 얻게 된다.
[해탈지견(=아생이진 범행이립 소작이작 자지불수후유 我生已盡 梵行已立 所作已作 自知不受後有)]
♥Table of Contents
▣○ 5온과 현상의 범주
경전 앞 부분에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란 표현이 나온다.
이는 일체 현상세계를 나눈 <범주>(유개념)이다.
일체 현상세계는 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포함된다.
현실에서 이 5 항목에 들지 않는 것은 없다.
또한 이 5온은 곧 <일반적으로 자신으로 잘못 이해하는 5요소>이기도 하다. [5취온]
또 마찬가지로 <타인, 타 생명으로 잘못 이해하는 5요소>이기도 하다.
♥Table of Contents
▣○ 불교의 기본적 진리
5온은 <현실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다음 <기본적 판단>이 얻어진다.
1 <이들 내용 일체>는 하나같이 영원하지 않다 [무상]
이는 생사현실에 대한 <사실판단>에 해당한다.
1 <일체의 생멸하는 현실>은 모두 <고통>과 관련된다. [고]
이는 생사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에 해당한다.
1 이들 내용의 <본바탕 실재>는 한 주체가 끝내 얻을 수 없고, 공하다. [공]
이는 현실내용의 <본바탕인 실재 측면>에 대한 판단이다.
1 현실 내용에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아, 무아, 무자성]
이는 현실내용에 대한 <영원불변한 실체>의 존부와 관련한 판단이다.
위 네 가지 판단은 <일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성립한다.
또 이들 내용은 <열반적정>과 함께 불교를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 진리>다. [법인 法印= 법의 도장]
아함경은 불교의 <근본 경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문한 이들이 처음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아함경 > 첫 부분에 이들 핵심 내용이 나열된다.
<공, 무아>는 <대승불교>만의 특유한 내용으로 여기기 쉽다.
그런데 근본경전인 『잡아함경』 첫 부분에 이들 내용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다음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 <근본경전>과 <대승경전>이 상호 관통되어 연결되어 있다.
♥Table of Contents
▣○ 일체에 공통된 내용
일체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무아) 및 열반적정이다.
이들 내용은 현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공통 적용된다.
현실에 <각 개별 현상>별로 <각기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어떠어떠하다고 말한다.
또는 소나무는 어떠어떠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일체가 그렇다>라고 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위 내용은 그렇지 않다.
<모든 현실 내용>에 공통된다.
따라서 위 내용은 <일체>에 공통되는 가장 기본적 진리다.
위 내용은 우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일체>에 대해 적용된다.
또 사후 어느 세계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다.
모든 현상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일체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개인적인 삶의 기본목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무아)에 대한 <기본 진리>를 이해했다고 하자.
이후 이에 기초해 삶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에 대해 경전에서 <다음 내용>이 이어 제시된다.
이처럼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에 대해 집착을 갖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염리, 희탐진]
그래서 탐욕 등의 <온갖 번뇌>를 끊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심해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사실을 증득하게 된다.
즉, 그 전에는 '망집에 바탕해 <나의 생이 있다>고 여겼다.
즉, 그 전에는 '망집에 바탕해 <일정한 부분>을 스스로 <자신>이라고 취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생사>가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집착을 갖고 임했다.
그런데 이들내용에 대해 바르게 관찰한다.
그래서 집착을 끊는다.
그리고 다음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은 이미 망집을 다 제거했다.
그래서 이처럼 망집에 기초해 받던 <생사>는 이미 다했다.
그리고 범행(청정한 수행)은 이미 섰다.
그래서 생사에 묶이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업의 장애>를 모두 제거했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다.
이후로 다시 망집에 바탕해 <생사>를 겪지 않는다.
그래서 생사 현실에서 다시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증득하게 된다.
생사현실에서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집착하여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받아나간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풀려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도달하게 되는 상태를 <니르바나>(열반)라고 칭한다.
<올바른 깨달음>으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아라한>의 상태가 된다.
여기서 아라한은, 수행자가 개인적으로 가진 수행의 <최종적 목표>를 성취한 상태다.
망집에 바탕한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올바른 <선업>과 청정한 <수행>[범행梵行]을 닦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악도 생사고통>을 벗어난다.
그리고 잘못된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을 남김없이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의 묶임>에서 완전히벗어난다.
이로 인해 <해탈>을 얻게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니르바나의 상태>를 증득하게 된다.
그래서 <아라한의 지위>에 이른다.
따라서 이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함경> 첫 부분에 담겨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처음 입문한 상태라고 하자.
이런 경우 수행자가 처음 배워야 할 <근본 경전>이 아함경이다.
수행자가 평소 세속에서 <어떤 일정한 생활>을 했을 수 있다.
또 평소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갖고 살아왔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다.
이런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처음 출가했다고 하자.
또는 어떤 이가 집에 머물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장 처음 받아 배우기 시작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대하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설법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있다.
<그 핵심>들이 이 짧은 경전에 포함되어 나열된다.
아함경의 <이 첫 부분>이 이해가 잘 이뤄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불교 수행>을 원만하게 잘 실천해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분>의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도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수행>을 포기하기 쉽다.
또는 <수행>을 하더라도 원만히 행해나가기 곤란하게 된다.
또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행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5온과 무상ㆍ고ㆍ공에 대한 의문내용
『잡아함경』은 짧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적 내용>이 이 안에 제시된다.
그래서 이해가 쉽지 않다.
대부분 <상식적 입장>에서 생사현실을 대한다.
그런 가운데 경전을 처음 대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들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나열해 살펴보기로 한다.
●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의 의미
우선, 경전에서
"색(色)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라고 제시된다.
그런데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낯선 표현>이다.
그래서 우선 이들 <표현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 분류의 의미
불교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를 <자신>과 <현실 세계>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자신>과 <현실세계>가 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자.
이 경우 곧 <현실 일체>에 대해 모두 판단함이 된다.
이 경우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자신과 세계를 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분류하는가.
또 이것이 왜 <일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자신을 포함해 <세계 일체>에 대해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왜 세계일체를 이처럼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나누어 관찰하는가.
● 일체를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보는 근거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은 <현실내용 일체>를 뜻한다.
그런데 다시 이들은 모두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일체가 그와 같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 내용이 왜 <바른 관찰>이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경전에서는 짧게 <그 결론>만 제시된다.
그리고 그 <의미>와 <근거>는 자세히 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무상ㆍ고ㆍ공ㆍ비아>를 근거로 싫어하여 떠날 이유
한편, <현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모두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런 경우 다시 <다음 의문>을 갖게 되기 쉽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는가.
또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가. [염리厭離, 희탐진喜貪盡]
한편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반드시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다음 의문>도 가질 수 있다.
그에 대해 <싫어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들이 <무상ㆍ고ㆍ공ㆍ비아>임을 관한다,
그런 경우 그처럼, <싫어하여 떠나는 일>이 잘 <성취>되는가.
또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상태>[염리, 희탐진]가 잘 <성취>되는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다.
경전에서는 <다음>처럼 제시한다.
"색(色)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괴로움, 공, 나가 아님도 같다.
이렇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니라.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고 하자.
그러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심해탈>(心解脫)이라 하느니라.
...
그런데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로 인해 <싫어할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다고 이로 인해 곧바로 현실을 <싫어할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현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성>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우선 음식을 <영원하다>고 여겨 좋아한 경우는 드물다.
또 <아름다운 이성>이 영원하리라 여겨 좋아하는 경우도 드물다.
한편 이제 이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사정이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드물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임>을 잘 이해한다.
또 어떤 것이 <한 순간밖에 얻을 수 없음>도 잘 이해한다.
즉 이들 일체가 <덧없음>도 잘 이해한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갈증>을 일으켜 <애착>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떤 소원이 성취되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딱 한 번이라도 <어떤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 <애착>을 갖는 대부분 사정이 이와 같다.
그래서 <다음 의문>을 갖기 쉽다.
어떤 이가 현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등을 관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이로 인해 어떤 이가 <현실 일체>를 반드시 싫어하게 되는가.
그리고 <떠날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가.
이처럼 <의문>을 갖기 쉽다.
한편 <다음 의문>도 가질 수 있다.
현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고 <반드시> 이에 대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처럼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일반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음처럼 의문을 갖기 쉽다.
현실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여긴다.
그런데 다음처럼 생각하기 쉽다.
- 이것을 굳이 싫어하고 떠날 <이유>가 없다.
또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을 굳이 없앨 <이유>도 없다.
이처럼 생각하기 쉽다.
한편, 다음처럼 <걱정>하게도 된다.
일체에 대해 <기쁨과 즐거움>을 없앤다고 하자.
그런 경우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처럼 오히려 걱정하게도 된다.
평소 현실에 대해 <집착>을 갖고 임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들이 <무상ㆍ고ㆍ공ㆍ비아>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이해만으로 현실에 대한 <집착>을 잘 버리지 못한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경전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의문>을 놓고 그 사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무상ㆍ고ㆍ공>과 <수행목표>
한편, 경전에서는 <해탈지견> 내용을 다음처럼 제시한다.
즉 어떤 이가 <현실의 정체>에 대해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고 하자.
그러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심해탈>이라 한다.
...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해탈>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이가 만일 스스로 <증득>하고자 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스스로 <해탈을 통해 얻는 지혜의 내용>[해탈지견]를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다.
즉,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
<범행>은 이미 섰다.
<할 일>은 이미 마쳤다.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아생이진... 불수후유]..
이런 내용이다.
결국 수행자는 현실을 올바로 관함으로 <마음의 해탈>(심해탈)을 얻는다.
그리고 이런 <심해탈>을 통해 위와 같은 상태를 <증득>한다.
그래서 이런 <해탈지견>은 불교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이런 <해탈지견을 얻는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해탈지견>의 내용
<심해탈>을 통해 <해탈지견>을 증득할 수 있다.
<해탈지견> 내용은 다음이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등이다.
[아생이진... 불수후유]
그런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세상에서는 <다음 견해>를 갖는 경우도 있다.
우선 죽은 뒤 ‘<자신>은 아주 없어진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것>은 이후 아무 것도 없게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다른 생명형태로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견>(斷見)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단견>을 부정한다.
그리고 중생들이 <망집>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무한히 <생사윤회>를 반복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을 제시한다.
<심해탈>을 통해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제시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다시 <다음 의문>을 갖게 된다.
경전에서 다음처럼 제시한다.
-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는 <단견>과 같은가?
즉 죽음 이후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 <수행목표 상태>와 <일반 상태>의 차이점
한편,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수행>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이는 <현실 일반 상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수행>을 행한다고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해탈지견>을 증득>한다.
그런 경우 <일반적인 상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무상ㆍ고ㆍ공ㆍ비아>와 <수행목표 상태>의 관계
<수행목표 상태>는 <일반 현실 상태>와 일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 <일체에 대한 근본판단>과 관련해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처음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수행목표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가?
즉, <일체>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수행으로 <심해탈 상태>가 된다.
그리고 <해탈지견>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무상ㆍ고ㆍ공ㆍ비아>' 아닌' 상태가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처음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처음 제시했다.
그런데 <심해탈>이나 <열반> 상태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 상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무상ㆍ고ㆍ공ㆍ비아>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처음 제시한 내용은 <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한편, <해탈>과 <열반>도 <일반 상태>처럼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면 <수행목표 상태>는 <일반 현실>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수행목표 상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런 전제에서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수행목표>와 <염리, 희탐진>
<심해탈> 상태가 되어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상태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다.
따라서 다시 <염리 희탐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즉, <수행목표 상태>도 <현실 내용>처럼 역시 싫어하고 떠나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 수행의 <근거>
<심해탈>에 이르러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일반 현실>과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 수행을 통해 <심해탈>을 굳이 얻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수행>은 <일반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를 행할 필요성이 있다.
불교를 처음 대할 경우 이런 <여러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
이상 일반적으로 <경전 내용>에 대해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법문의 이해와 실천 수행의 순서
『잡아함경』은 간결하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적인 사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해가 반드시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 접한 경우 이런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된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바로 실천한다.
이런 수행자세가 바람직하다.
우선 당장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믿고 받아들인다.
그런 가운데 이를 실천해간다.
그처럼 '실천 수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에 따른 수행결과를 얻는다.
그리고 수행결과를 얻은 상태에서는 그 법문 내용 이해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을 우선 행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의미를 점차 이해해 간다.
이런 수행자세가 바람직하다.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의미를 묻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앞과 같은 사정으로 그 내용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믿고 실천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로 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수행결과를 얻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행의 성취로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된다.
반대로 이들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이해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경우 내용을 이해한 의미와 효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경전 가르침을 믿고 바로 실천 수행한다.
그리고 내용 이해는 이후 천천히 시간을 내, 이해하고 증득해 간다.
물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그 순서를 위와 같이 한다.
이런 자세가 더 낫다.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이들 내용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좋다.
즉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 대부분 <애착>과 <탐욕>을 갖고 생활한다.
이에 대해 일단 경전 가르침을 적용하여 임한다.
그래서 경전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관한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 놓는다.
그리고 마음의 해탈을 얻는 노력을 한다.
세상에서 <애착>을 갖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지위, 명예...등이다.
그리고 이외 <자신과 자신의 것>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계 일체>에 집착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색ㆍ수ㆍ상ㆍ행ㆍ식>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들 <색, 수, 상, 행 식>의 정체에 대해 먼저 올바로 관한다.
그래서 이들이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며, 참된 진짜가 아닌 무아며, 공함>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들에 가졌던 <잘못된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들이 <집착을 갖고 대할 만한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이에 대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묶인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 머무른다.
현실에서 망상분별에 바탕해 <집착>을 갖고 대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망집>을 다 제거한다.
그래서 평소 집착을 갖고 대하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자.
그렇다해도 <평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가진다.
그러면 이를 통해 <마음의 해탈>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해탈지견>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먼저 행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후 시간을 내서, 이들 <내용의 이해를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과 법문의 이해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무조건 <진리>라고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 취지는 아니다.
이들 내용은 부처님이 설했다.
그러므로 이를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권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하나다.
그래서 이들 내용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곧 수행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다음처럼 제시한다.
‘진리에 의존하고 자신에 의존하라.’
그래서 각 경전 내용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반적 의문사항>을 나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잡아함경』 첫 부분은 다른 <대승경전>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대승 경전> 내용도 함께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불교 <특수용어>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 피해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되도록 <기초적 내용>에 대해 간결하게 살피기로 한다.
한편, 각 사항마다 논의를 되도록 <독립적>으로 살펴가기로 한다.
그런 사정으로 일부 내용은 <중복>되더라도 각 부분에 반복 서술해 살피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다시 살펴나가기로 한다.
◧◧◧ para-end-return ◧◧◧
♥Table of Contents
▣○ 생사고통과 현실의 정체 이해
『잡아함경』 첫 부분에서 <5온>이 제시된다.
그리고 <무상ㆍ고ㆍ무아ㆍ공 >이 제시된다.
그리고 <심해탈>ㆍ<해탈지견> 내용이 나온다.
이들 각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을 <5온>이라고 하는가.
왜 일체가 <5온>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이들 현실 일체는 왜 <무상ㆍ고ㆍ무아ㆍ공>인가.
그리고 이들 현실내용의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고 하자.
그러면 왜 <심해탈>을 이루게 되는가.
또 <심해탈>을 이룬다고 하자.
그러면 왜 현실의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이런 등등의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는 대단히 깊고 복잡한 철학적 주제와 관련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그런데 『잡아함경』은 불교의 <기본 경전>이다.
그래서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가 대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처럼 처음부터 현실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강조한다.
그 사정은 다음이다.
본래 <수행>이란,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현실 과 생사고통>의 <정체>에 대해 올바른 관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사정으로 처음부터 현실에 대한 <올바른 관찰>이 강조된다.
그래서 이들 내용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일반적 입장에서 수행에 들어가는 기본 계기
일반인도 <좋음>을 추구한다.
그리고 <나쁨>을 제거하려 한다.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세속에서 <일반인>이 취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수행방안>은 이들과 방향이 크게 다르다.
『잡아함경』 첫 부분에서도 이런 사정을 볼 수 있다.
...
현실 일체 즉 <5온>을 싫어하여 떠난다.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을 없앤다.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심해탈(心解脫)이라 하느니라.
...
이런 내용이 제시된다.
수행을 통해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수행 방안>은 <세속의 입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그처럼 내용이 제시되는 <사정>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크게 <다음의 사정 >이 있다.
- 우선 세계와 한 주체의 <본 정체 >파악에 차이가 있다. [실상론]
- 그런 가운데 <한 주체의 삶>으로 <고려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단멸관]
- 또 <인과관계>의 파악에도 차이가 있다. [연기론]
-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가치판단>에도 차이가 있다. [수행론]
- 그리고 <목표>와 이를 성취하는 <방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수행론]
일반적으로 <망집>을 일으켜 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런 가운데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한다.
이 각 경우 실상을 꿰뚫어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리고 각 내용의 관계를 <넓고> <길고> <깊게> 올바로 관찰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그 결론은 앞 입장과 <정반대>로 서로 차이 나게 된다.
따라서 각 내용을 <올바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일반 입장에서 수행에 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단멸관>의 제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잘못 여기기 쉽다.
한 주체가 죽음을 맞이한다.
- 그런 경우 그 주체와 관련된 것은 모두 끝이다. [X]
이런 입장을 <단멸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단멸관>을 취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오로지 <한 생>만 고려해 가치판단을 행하기 쉽다.
따라서 세속에서는 대부분 <현재 1생>만 고려하며 삶에 임한다.
그리고 <사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사윤회>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서 <사후 생>을 고려한다고 하자.
그러면 비로소 <넓고> <길게 >가치판단을 행하게 된다.
그런 경우 <1생>만 고려하며 행하는 가치판단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는 <세속적 입장>과 크게 다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가치판단이 세속을 떠나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수행>을 행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가장 먼저 <단멸관>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 과정에 작용하는 인과>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망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망집>의 뿌리가 대단히 깊다.
그래서 일반적 상태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가 곤란하다.
따라서 처음 상태에서는 일단, <부처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믿음>에 바탕해 수행을 실천한다.
그러면 일단 <생사고통>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수행에 따른 <결과>를 직접 <증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또 직접 <이들 내용>을 쉽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내용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현실 입장>에서라도 <가치판단>부터 잘 행해야 한다.
현실에서 <가치가 적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로 인해 <가치가 보다 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가치가 훨씬 큰 내용>들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일단 <가치가 적은 것>은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가 큰 것>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올바로 <가치 판단>을 한다.
그러면 먼저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과정에서 <고통을 제거함>이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 <생사과정>에 이해가 깊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아직 완전히 <단멸관>을 제거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사후 상태>에 대해 어느 입장이 옳은지를 잘 모른다.
그런 경우 사후의 <다양한 가능성>을 일단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생>만 고려할 경우도 있다.
한편 <사후 생>까지 고려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어느 <경우>나 모두 <좋은 상태>를 얻어낼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1생>의 삶만 고려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가장 가치 있는 상태>가 있다.
그리고 이는 역시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 입장에서는 처음 이런 판단을 통해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현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하자.
그러면 <수행>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가치문제>부터 먼저 자세히 살펴야한다.
물론 이는 <본 수행>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 입장에서 이런 <기초적 판단>부터 잘 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세속적인 입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 <망집>에 바탕해 현실에 임하게 된다.
일반적 입장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일반적인 입장에서 세속의 가장 <기본적 내용>부터 살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수행>에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아래에서 먼저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기초적으로 세속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일반적 입장>은 <망집>의 뿌리가 깊다.
그런 가운데 <좁게> <자신>만 집착해 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짧게> <단멸관>을 일반적으로 취한다.
즉, 삶의 문제를 <1생>에 국한해 짧게 관한다.
그리고 <얕게>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측면>만 집착한다.
또한 <인과 >판단도 <넓고> <길고> <깊게> 잘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치 판단>을 잘못 행한다.
그런 가운데 삶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다.
그리고 또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선 <다양한 상태>를 놓고 <가치판단>부터 잘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먼저 잘 인식해야 한다.
한편, 생사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는 상태>와 <받지 않는 상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갖는 <가치>의 차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세속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단멸관>을 제거한다.
그래야 비로소 <경전에 제시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들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고통의 임시적 제거와 근본적 제거 방안
<망집>을 바탕으로 생사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에 바탕해 <좋음>과 <나쁨>을 섞어 받게 된다.
현실에 <좋음>ㆍ<나쁨>ㆍ<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음>ㆍ<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상태>가 섞여 있다.
그런 가운데 생활 과정에서 어떤 <나쁨>을 겪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선 <그 나쁨>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 고통 받는다.
그러면 일단 약을 먹고 낫기를 원한다.
그러다가 다시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그러면 또 치료를 받아 통증을 없애기를 원한다.
이처럼 처음에는 <생활에서 겪는 고통>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를 원한다.
당장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수행>도 힘들다.
따라서 <당면한 고통>을 제거하는 노력아 필요하다.
생사현실에서는 당장 <간난신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문제부터 잘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계마저 해결하기 힘든 심한 <빈곤>,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질병>,
노예처럼 묶여 지내는 <신분적 예속>,
또는 <죄>를 범해 감옥에 구금된 상태
이런 상태부터 우선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당면하는 고통>을 하나하나 제거한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생사고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고통의 <근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의 <근본>을 끊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결국 <수행>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좁고 짧고 얕은> 관찰과 <넓고 길고 깊은> 관찰
일반적으로 <고통>을 피하고자한다. 그리고 <좋음>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좋음>을 얻기 위한 여러 수단적 방편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건강ㆍ장수ㆍ시간ㆍ공간ㆍ즐거움ㆍ지혜ㆍ지식ㆍ미ㆍ인격,
직업ㆍ물질적 풍요ㆍ좋은 인간관계ㆍ사랑ㆍ결혼ㆍ가정ㆍ권력ㆍ지위ㆍ자유ㆍ여가를 원한다.
그리고 또 <타인ㆍ사회ㆍ자연>에 대한 <다양한 희망>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성취해 만족ㆍ기쁨ㆍ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생활에서 재미ㆍ웃음ㆍ보람ㆍ가치ㆍ평온ㆍ안정을 누리고자 한다.
그리고 의욕에 찬 생활을 원한다.
그런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희망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반대로 갈증, 불만, 불쾌를 해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짜증, 우울함, 슬픔, 분노를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죄책감, 비난, 불안, 초조, 긴장,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공포를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의욕 없이,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무료함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해 삶에 임하기 쉽다.
즉 '좁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만 집착한다.
그리고 '짧게' <지금 당장의 순간>만 고려하기 쉽다.
그리고 단멸관에 바탕해 길어도 <자신의 1생 범위>로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얕게' 자신이 초점을 맞춘 <일부 측면>만 관심을 둔다.
그러나 현실을 '<넓고ㆍ길고ㆍ깊게' >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바탕에서 <나쁨>을 제거하고 <좋음>을 얻어낼 방안을 찾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좁고 짧고 얕은> 관찰과는 대부분 <반대 방향>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넓고 길고 깊은> 관찰에 바탕한 좋음
<수행방안>과 일반적인 <세속의 입장> 차이는 먼저 <가치판단> 방식에 있다.
즉, 좋음에 대한 <가치 판단>에 차이가 있다.
먼저 <단순히 나쁨>과 '<나쁘고 나쁨>'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자신>에게 <지금 당장> <일정한 측면>에서만 <나쁨을 주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나쁨>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자신>도 나쁘고, <남>도 나쁘고, <온 생명>이 차별 없고 제한 없이 나쁘다.
그리고 <지금>도 나쁘고, <나중>도 나쁘고, <오래오래> 나쁘다.
그리고 <이 측면>도 나쁘고, <저 측면>도 나쁘고, 두루두루 <모든 측면>에서 나쁜 경우가 있다.
한편, <좋음>에도 <단순히 좋음>과 '<좋고 좋음'>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자신>에게 <지금 당장> <어떤 한 측면>에서만 <좋음을 주는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어떤 좋음>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자신>도 좋고, <남>도 좋고, <온 생명>이 차별 없고 제한 없이 좋다.
그리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오래오래> 좋다.
그리고 <이 측면>도 좋고, <저 측면>도 좋고, 두루두루 <모든 측면>에서 좋다고 하자.
이는 <단순한 좋고 나쁨 [好悪호오]>과 <선악>의 차이에 상응한다.
이 <두 내용>은 차이가 크다.
삶에서 <생사고통>을 제거하고 <무량한 복덕>과 <무량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나쁨>은 일체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온 생명>이 차별 없고 제한 없이 좋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장구하게> 좋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두루두루> 좋음을 얻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일체 <고통>과 <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명이 다 함께 <번뇌>를 제거하고 <생사고통>을 제거한다.
그래서 <자리이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다.
그리고 <다른 중생>도 이를 구족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성불>과 <중생제도>의 서원을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서원을 <유희ㆍ자재ㆍ신통>을 바탕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런 내용은 너무 <이상적>인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 <결여>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부분이 곧 삶의 <생사고통> 문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소원>과 <서원>의 가치
세속에서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다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각 주체는 제각각 모두 <일정한 좋음>을 얻고자 한다.
일반적인 소원은 주어가 보통 <자신>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병이 낫게 되기를 바란다.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주체>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가 좋음을 준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좋음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당장 배고픔을 면하려고 <닭>을 잡아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상대는 <생명과 신체>를 침해받는다.
그래서 이런 <업>은 각 주체 간에 <가해 피해관계>를 쌓게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업장>이 쌓인다.
그래서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되돌려 받아가게 된다.
이 사정을 <자신>을 놓고 이해해보자.
어떤 <다른 주체>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해쳤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은 그에게 <동등한 해>를 끼쳐 <보복>하려 하게 된다.
이는 <다른 주체>를 <장애하고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런 가운데 그처럼 <보복>하려는 뜻이 성취된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주체>는 <고통>을 돌려받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후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후 다시 <상대>가 그런 노력을 해나간다.
그래서 이후 이런 관계를 <반복>해간다.
그런 가운데 각 주체 간에 <가해ㆍ피해 관계>가 중첩된다.
결국 <어떤 한 주체>가 <자신> 입장에서 <당장>의 <좋음>만을 추구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다른 주체>의 좋음을 침해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각 주체들이 이를 놓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각 주체를 <생사고통>에 묶이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각 주체의 <업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각 주체의 뜻의 <성취>가 대단히 힘들게 된다.
그리고 비록 성취되더라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를 <넓고 길고 깊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경우는 얻게 되는 <좋음>보다 <나쁨>이 많게 된다.
반면 <어떤 희망>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예를 들어 <자신>도 좋고, <남>도 좋고, <온 생명>이 차별 없이 좋다.
또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오래오래> 좋다.
이 <측면>도 좋고, 저 <측면>도 좋고, 두루두루 <모든 측면>이 좋다.
이런 경우는 앞과는 다르다.
어떤 이가 이처럼 <온 생명>을 <제한> 없고 <차별> 없이 좋은 상태를 추구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뜻의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가 제거된다.
그리고 방해하던 힘은 <성취를 돕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 뜻의 <성취>가 상대적으로 쉽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정으로 성취된 상태도 이후 오래 <유지>되게 된다.
이 두 경우는 좋음의 <수>와 <양>과 <기간>과 <질>이 다르다.
<처음의 경우>는 <자신> 입장에서 <<당장> <일정한 측면>에서의 좋음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온 생명>이 <오래오래> <두루두루> 좋음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갖는 좋음의 <수>와 <양>과 <기간>과 <질>이 훨씬 크다.
따라서 <그 가치>가 훨씬 크다.
따라서 평소< 희망 내용>을 이런 형태로 바꿔 추구한다.
이런 자세가 바람직하다.
한 주체가 갖는 <희망>을 이처럼 가치 있는 형태로 쉽게 바꿔 갖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병에 걸려 <병>이 낫기를 바란다고 하자.
이런 소원 내용에서 <주어>를 우선 <온 생명>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피해를 받는 <다른 주체>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래오래 그런 상태가 <유지>될 방안을 찾는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더 좋은 상태가 얻어질 방안을 찾는다.
이런 형태로 <희망>을 바꾼다.
그러면 처음 희망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내용이 된다.
그러면 곧 <수행자의 서원>에 가까워지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좁고 짧고 얕은> 관찰에 바탕한 가치판단의 문제점
삶에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가치판단>을 행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다.
우선 하나의 <현실>에서 잘못된 가치 판단을 행하는 사정이 있다.
♥Table of Contents
▣- 당장 <외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
가치 판단과정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사정을 상자로 비유해 살펴보자.
어떤 이가 <상자>를 대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기 힘들다.
한편, 상자가 나타나게 된 <과거의 과정>을 보기 힘들다.
또 그 상자가 도 보기 힘들다.
한편, <먼 곳>에 놓인 상자는 역시 보지 못한다.
또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보지 못한다.
또 <어두워도> 내용을 잘 보지 못한다.
한편 눈에 <질병>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보지 못한다.
또 상자를 보게 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단지 <초점을 맞춘 내용>만 의식하고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상자에 붙여진 <라벨>과 <가격표>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상>이나 <형태> 및 다른 <질적 측면>들을 모두 외면하기 쉽다.
이처럼 상자 하나를 대할 때도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
또 <각 내용>을 보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고려>할 도리가 없다.
<가치>를 판단할 경우에도 사정이 같다.
그래서 <가치판단>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것을 빠뜨리기 쉽다.
그리고 단지 <초점>을 맞춘 일부 내용만 고려하기 쉽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가치 판단>을 행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각 <주체>의 <내면 내용>
한 주체는 주로 <자신>만 고려하며 임하기 쉽다.
그래서 <다른 이의 입장>은 잘 의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대해 <각 주체>가 얻는 <느낌>, <분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주체의 마음안 내용>은 서로 간에 의식하지 못하기 쉽다.
그런 가운데 <외관>으로 드러난 것만 주로 고려한다.
그래서 <외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은 고려에서 빠뜨리게 된다.
따라서 <잘못된 평가>를 한다.
♥Table of Contents
▣- <초점 외> 잠재된 내용
한편 <각 주체>는 <세상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모두 미리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경험>과 <지식>이 적은 경우 이런 경향이 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닫힌 좁은 경험 범위>에서 일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주로 <자신의 희망>에 치우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경우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실질보다 <가치가 크다>고 잘못 여긴다.
이는 <현미경>으로 작은 물건을 대하는 경우와 같다.
그런 경우 <초점에 맺힌 것>만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미세한 것>을 마치 <우주 전부>인 양 여기기 쉽다.
현실에서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해 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다음 문제>가 있다.
현실의 <고>와 <낙>은 서로 상대적 관계로 분별해 얻는다.
그래서 <일정한 좋음>에는 <그 배후>에 <상응한 나쁨>이 전제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시합에서 이겨 좋아한다.
이런 경우 이기지 못한 <다른 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 뜻을 지금 성취해 좋아한다.
그것은 다른 경우에 <뜻이 성취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 상태>가 전제된다.
또 보석이 빛나 좋다고 여긴다.
그런 경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된다.
그런 경우 <표면에 드러나는 좋음>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자.
그러면 의식 표면에서 <좋지 않음>은 일단 숨는다.
그러나 <좋음을 얻는 뒷면>에 그런 내용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Table of Contents
▣- <당장의 감각, 느낌>에 치중
<장래>나 <먼 곳의 일>, 또는 <다른 주체의 입장>은 이성적 분별로 헤아린다.
그러나 <당장 대하는 현실>은 <감각>과 <느낌>, <감정>이 동반된다.
그런 사정으로 각 주체는 <당장 대하는 현실>에 좀 더 치우친다.
그래서 <장래>나 <먼 곳의 현실>은 외면하기 쉽다.
또는 <다른 주체의 입장>도 같다.
이는 이성적 분별로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판단과정>에서 이를 빠뜨리기 쉽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치 판단>을 잘못 행할 수 있다.
▼▼▼-------------------------------------------
이하의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11장_종교학_(9).txt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001.txt id="029"
-------------------------------------------
♥Table of Contents
▣- 인과에 대한 무지
각 <현실 내용>은 <인과관계>상 서로 묶여 있다.
<현실의 한 내용>은 다양한 <다른 요소>와 결합한다.
그리고 <다양한 결과>를 만든다.
그런 사정으로 <현재 내용>은 <과거의 다양한 내용>과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
또 <미래의 많은 내용>도 <현재>와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
이처럼 하나의 <현실 내용>에 많은 <원인>과 <결과>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각 내용>은 각기 많은 <좋음>과 <나쁨>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어떤 좋음>을 얻기 위해서 <인과관계>상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원인 과정>이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좋음>이 나중에는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그와 인과관계로 묶인 전 과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선택으로 나타날 결과>는 다양하다.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들 내용>은 당장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보이지 않는 <과거 원인>이나 <미래 결과>를 빠뜨린다.
결국 <판단과정>에서 이런 사정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망집>에 바탕해 <탐욕>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좋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이는 <다른 주체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그리고 <장래 다른 측면>에서 <고통>을 되돌려 주게 된다.
결국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해 좋음을 추구한다고 하자.
이는 <나중에 되돌려 받는 나쁨>과 <인과>상 묶여 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지금 <이 측면>에서 얻는 <좋음>이 있다.
이는 <하나의 좋음>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쁨>을 얻게 되는 <주체>는 무량할 수 있다.
또 장래 무량겁에 걸쳐 이로 인해 돌려받는 <나쁨>도 무량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 들어 있는 <나쁨>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얻는 <좋음>보다 <나쁨>이 더 많게 된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늘 미리 잘 헤아려야 한다.
※ 가치의 다층 단계
현실에서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다양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이집트에서 홍수 범람이 발생한다.
그러면 토지마다 경계선이 없어진다.
그러니 주민마다 시비가 발생한다.
1 수학적 물리적 수와 양.
그래서 재 측량해서 경계를 재획정 한다.
그래서 피라미드 등을 측량 기준점으로 잡아 토지 경계선을 다시 그려 줘야 한다
그래서 기하학이 발달된다.
이 경우는 단순히 물리적 수나 양 길이 면적 부피 등의 문제다.
면적이 각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을 농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넓게 차지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가 문제된다.
2 그것의 현재가격.
- 주변상황 - 다른 물리적 양의 중첩 [질] - 시장거래가격
그런데 홍수 이후 주변 환경 등이 바뀌었다
주변이 황량하고 길이 다 끊겼다고 하자
그래서 다시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또는 그 자체가 갖는 다양한 특질과 성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고 하자.
물질적 양 자체는 같아도 그 거래 가격이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번화가 땅은 벽지에 땅과 면적은 같아도 그 가격이 수백배가 될 수 있다.
이는 이런 측면을 나타낸다.
3 그것이 산출해 내는 생산량
- 수확 산출량
이전 토지 대장 면적 대로 되었다고 가정한다.
한편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이 농사와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 땅의 토질이 다시 문제된다.
홍수가 나서 어떤 곳은 비옥해졌다.
그러나 어떤 곳은 자갈만 쌓여 있다.
면적은 같다고 해도 이처럼 형질이 바뀌었다
이는 토지에서 곡물 수확량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단순히 면적만 문제삼기 힘들다
4 순이익 (수익 - 비용)
그런데 수확량이 늘어도 문제다
각 땅에서 기르는 작물이 다르다.
그런 가운데 수확기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다르다
이 경우 수확(판매)량 * 가격이 문제된다.
이 경우 이익(이윤)= 수익(판매수입) - 비용 식이 기준이 된다.
즉 자신의 농지의 토질이 원하는 대로 좋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질만 비옥해지고 좋으면 좋은가가 또 문제된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
당연히 비옥한 땅에서 기후가 좋으면 많이 잘 자랄 것이다.
그런데 수확기가 되니, 곡물이 풍작이 된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가 없다.
남으면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곡물값이 헐값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곡물을 시장에 가져가면 운반비나 처리비용 등을 거꾸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다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곡물 수확은 상대적으로 흉작일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대단히 비싼 가격을 받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 수익 - 비용 식을 계산한다
그러면 각 경우가 또 달라진다.
그래도 일단 생산과정에서는 순 이익 (이윤)이 많은 쪽이 좋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수익과 비용 계산을 엉터리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계산이 엉터리라고 하자.
그런 결과 실질적으로 낙타와 같은 일만 평생하고 사라지게 된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걷는다.
그러다가 어떤 유리조각을 하나 줍는다.
그래서 자신은 이 유리조각을 거져저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것을 보면서 10 만원 줄 테니 그것을 자신에게 주라고 한다.
그래서 주었다.
알고보니 그것이 1억원 정도 하는 1 캐럿 다이아 몬드였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주은 이가 이렇게 생각한다.
자신은 그것을 얻는데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10 만원을 번 것이다.
이 때 과연 이 사람의 판단이 적절한가
이러한 것이 이 단계에서의 문제다.
일단 엉터리다.
비용 계산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자신이 무엇을 하던간에,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소모가 된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소모된다.
그러니 그것은 비용이다.
다만 완전히 생명 신체가 폐기될 때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것 뿐이다.
그러면서 하루에 설령 10 억원을 벌어도 이 비용은 충당이 안 된다.
물론 이런 경우 다이아몬드를 얻어도 역시 충당이 안 된다.
그런데 위 경우는 겨우 10 만원을 얻고 벌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가정한다.
그래도 정작 죽으면 자신이 가져가지도 못한다.
자신이 그렇게 못하듯 그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면서 자연히 부채가 누적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과정에서 그 모습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기계와 사정이 같다.
차가 폐차가 된다.
그러면 새차를 구해야 된다.
이 경우 미리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넘는 수익을 계속 얻었어야 한다.
그래야 폐차 된 이후 그 수익으로 종전보다 좋은 차를 구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다음 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 신체 > 우주의 보물 > 1년 한국가의 예산액 > 500 조원
이 사람의 생명 신체가 100 년을 넘지 않아 폐기되게 된다.
따라서 한 주체는 그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을 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매일 소모되는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을 비용으로 평소 계산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이는 자신의 활동과정에서 들어가는 생명 신체의 감가상각비용 문제다.
그런데 현실의 회계사 들이 전부 이 부분을 빠뜨린다.
만일 이번 생만 살고 끝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차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죽는 순간 부채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다.
또 거둔 이익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다.
이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않다.
생사과정에서는 문제가 된다.
알게 모르게 매일 생명 신체가 소모된다.
그래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히 생명 신체는 소모된다.
그런 가운데 산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익을 매일 얻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수익도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보시를 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공덕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공덕은 있다.
즉 하루에 엄청난 가치를 갖는 생명과 신체를 소모시킨다.
그러면서 어떤 활동이든 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에 해당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자.
그려면 손해가 누적된다.
그리고 처음 생을 출발한 이유 가졌던 자산을 소모한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부채가 크면, 종전 상태보다 좋은 상태로 다음 생을 시작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 다만 이는 생사 이후를 고려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뒤에서 수행과 관련해 따로 보게 된다
여하튼 이것이 3 단계 [이익=수익-비용] 공식이 제시하는 문제다.
5 총기간의 총수익
1기-이후 총기간의 총수익
1기만 순이익이 작은 경우 - 2기 이상 총 기간에 총 수익이 큰 경우 >
1기만 순이익이 큰 경우 - 2기 이상 총 기간에 총 수익이 적은 경우
6 순이익으로 교한 취득가능한 재화와 용역
총 수익 물(교환된 물건, 화폐)의 시장교환가치 (가능성)
그런데 그 이익금액만으로 단순히 살피기 곤란하다.
생산물을 화폐나 물건으로 시장에서 교환해 얻었다
이 상태에서 그것으로 다시 구매 가능한 물건과 용역에 내용의 양과 질이 다르다
즉 판매 수익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물건과 용역의 양이 다르다
화폐인 경우는 인플레가 문제된다
또 무역이라면 각국 화폐간 교한 비율 즉 환율이 다르다.
전쟁 시 화폐를 많이 발행한 경우 전후에 화폐가 많아도 구매할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
( 전후 독일, 폴란드 수레에 가득한 화폐 ~ 성냥 1개 구매도 곤란)
시대 상황에 따라 아무리 화폐가 많아도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00년전 핸드폰)
한편 그 구입 제품의 품질이 달라졌다
그리고 기간이 달라졌다.
즉 물질적인 상태가 달라졌다
한편 그 수익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감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생각해서 우유 1톤과 천만 원은 처음에는 같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우유는 썩는다
그리고 천만 원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떤 것이 점차 가치가 오르는가가 문제 된다
유한 카드 VS 무한카드 ( 생존 필수품 외 사용 수익 가능 )
7 취득한 재화소비로 인한 순효용 (효용-비용)
- 소비로 인한 순효용 (효용-비용)
그런데 이제 그 수익으로 소비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바꿔 얻는가.
우선 소비활동을 하고 생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소비로 즐거운 맛을 얻는다.
그래서 순 효용 = 효용 - 비용지출(희생)식이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로 얻는 효용을 문제삼는다.
그래서 순이익이 수천억원대인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자.
그것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된다.
일단 큰 순이익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좋은가를 살펴야 한다.
이 경우는 다시 다음 식이 적용된다.
소비를 하면 기분이 좋은 효용을 얻는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을 갉아 먹는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 비용을 얻는데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이 다음식이 중요합니다.
순 효용= 총효용 - 비용
예를 들어 놀이터를 가서 노는데 입장료가 10 만원이 든다.
그런데 자신이 재미 있다고 볼 놀이기구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타지를 못한다.
...
그리고 다른 것을 타니 재미도 없다
그리고 공연이 부상만 당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짜증이 나는 소비가 된다.
돈을 들였다
하지만, 짜증만 얻은 경우다.
또 그 반대는 반대다.
8 효용 만족의 양,질,기간 둥 다양한 측면→ 행복
만족의 다양한 측면 (양,질기간) → 행복
소비단계에서 순효용만 많이 얻으면 최고인가
여기에서는 앞 각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는 일단 다 빼기로 한다.
즉
→ 홍수나 불이 난 뒤에 집과 토지를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끝에 못 찾았다
→ 열심히 농사도 짓고 물건도 팔았다
그런데 결국 손해를 보고 파산하고 망했다
→ 일도 많이 하고 이익은 엄청 많이 얻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일만 하고 정작 그것으로 아무런 즐거움은 얻지도 못했다
짜증과 두통만 남았다
→ 그런데 그 이익으로 관광도 하고 소비도 많이 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긴 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별로 즐거움과 보람도 없다
그리고 기분만 상했다
→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일단 제외한다
그러나 단순히 어느 한 욕구가 성취된다
그러면 만족을 얻는다
그렇다고 충분하지 않다.
만족 vs 성취되지 않은 상태의 불만 갈증
즐거움 (→ 다른 여러 만족과의 조화성 ) vs 어느 하나는 성취되었으나 나머지가 성취되지 않은 상태 ( 예: 배는 부르다 + 그런데 주변이 시끄럽다. 주변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 )
기쁨 ( → 만족의 강도, 양) vs 성취되었지만 늘 있는 일이다. 다른 이들도 다 성취한다
좀처럼 성취되지 않다가 갑자기 성취되어서 놀랄 정도는 아니다.
보람 ( → 만족의 주란적 질적 평가 ) vs 성취는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다.
가치 ( → 만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 vs 성취는 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취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피해를 주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
평온 (→ 만족이 유지되는 시간적 평가 ) VS 성취는 되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곧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정 (→ 만족이 유지됨에 대한 주관적 평가 ) vs 성취는 되었지만 그 상태가 곧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다. 예를 들어 계곡에 집을 지었다. 일단 지금은 좋다. 그러나 언제라도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면 없어질 것 같다.
희망 (→ 새로운 만족을 얻을 수단 ) vs 성취는 되었다. 그런데 더 다른 희망이 없어서 무료하다.
의욕 ( →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vs 성취는 되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그래서 권태롭다.
이런 식으로 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나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경우 마다 잘 성취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런 측면이 골고루 조화돼서 계속 순환하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 가운데 즐겁고 보람 있게 행복을 누리는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추상적으로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9. 순 행복 ( 행복 - 불행)
그런데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는 희생이나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어차피 행복하다.
그것도 최저 비용을 들여 그렇다.
비용이 단순히 최저일 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이런 것이 행복을 현명하게 얻는 상태다.
그래서 행복의 양과 질, 시간을 따져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상태가 좋다.
그래서 되도록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는 것이 좋다.
10. 총기간의 순행복
1기의 순행복~ 2 기이상.
1기만 순행복이 작은 경우 - 2기 이상 총 기간에 총 행복이 큰 경우 >
1기만 순행복이 큰 경우 - 2기 이상 총 기간에 총 행복이 적은 경우
(기간의 문제는 생산과정과 같다. 이에 준한다)
11. 아름답고 선한 행복
행복의 상위 가치 - 중첩된 좋음 - 아름다운 선
어차피 행복한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 상태인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을 얻은 상태로 가야한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행복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제 자신은 행복하고 넘치고 넘친다.
그래서 더는 필요없다.
이런 단계에서만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또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찾을 수 있다.
이 때 이런 원리가 제시된다.
행복이란 단순히 말하면 좋음이다.
그런데 좋음에도 상태가 다른 좋음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물건을 뜻대로 훔쳐도 뜻을 성취해 만족을 얻는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좁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좋다
짧게 지금 당장만 좋다
얕게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이 측면만 좋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넓게, 자신도 놓고 상대도 좋다
그리고 자기와 남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제한없고 차별없이, 좋음을 준다.
길게,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오래오래 무궁하게 좋다.
깊게, 이 측면도 좋고 저 측면도 좋고 두루두루 모든 측면이 좋다.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넓게, 자기도 나쁘다 남도 나쁘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제한없고 차별없이, 나쁨을 준다.
길게, 지금도 나쁘고 나중도 나쁘고 오래오래 무궁하게 나쁘다.
깊게, 이 측면도 나쁘고 저 측면도 나쁘고 두루두루 모든 측면이 나쁘다.
물론 이 각 경우는 모두 지나치다
그러나 여하튼 이론상 각 경우는 각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과 같은 경우를 향하는 경우가 더 낫다
가장 좋은 상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상태다
그러라 현실에서 그 어느 한 부분에 결함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만큼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선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주관적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높게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다시 그 양이나 유지되는 범위 등이 또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행복을 얻는 수단을 상위 가치로 놓는 경우
사는 동안 즐겁고 행복만 하면 최고인가
이런 문제가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논의가 된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다음 문제가 생긴다
어차피 행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상대가 더 나은가
이것이 문제된다.
그런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차피 행복한 것은 같다고 하자.
그러면 행복하지만 돈이나 지위가 많은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처음 생각하기 쉽다.
행복은 자신의 행복이던 남의 행복이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나 지위는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서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을 갖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기 쉽다.
그런데 이것은 뒤 바뀐 논리다.
우선 그 상태로 가보면 된다.
즉 그런 것을 외관적으로 차지한 상태로 가보자.
예를 들어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사람들이 다 자신을 부러워 한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재산으로 놓고 싸운다.
서로 불화가 심하다.
또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
재산이 많아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비와 소송이 많아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 이렇게 말한다
그 수많은 재산과 지위가 결국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한다
그러나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공연히 불평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
그 당사자가 그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런 상태에 가보면 안다.
그래서 수많은 재산과 지위를 차지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이제 그것으로 다시 무엇을 얻어내야만 하는가
끝내 무엇을 얻어야 진정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h라고 표시를 한다
결국 그 h를 얻어 내야 한다
그 h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별 필요가 없다.
그런 결과 다음을 알게 된다
즉 외관상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무언가 더 가치있는 h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이 경우 그런 수단은 남들 눈에 보인다.
즉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지위는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무언가 h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꾸로 뒤집혀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알고보면 그런 지위나 돈은 h 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비용이다.
이경우 다음이 오히려 현명하다.
같은 h을 얻는데 오히려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단을 적게 들인다.
이런 경우가 현명하다.
예를 들어 이는 다음과 같다
가게에서 같은 물건을 사서 구하려 한다
이런 경우 그것을 이왕이면 적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구하는 낫다.
이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과 같은 각 내용은 결국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한 개인이 성취를 바라는 항목은 대단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건강ㆍ장수ㆍ시간ㆍ공간ㆍ즐거움ㆍ지혜ㆍ지식ㆍ미ㆍ인격,
직업ㆍ물질적 풍요ㆍ좋은 인간관계ㆍ사랑ㆍ결혼ㆍ가정ㆍ권력ㆍ지위ㆍ자유ㆍ여가를 원한다.
그리고 또 <타인ㆍ사회ㆍ자연>에 대한 <다양한 희망>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들 모든 항목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 물리적 양이나 기간은 이미 앞 단계에서 살폈다
그런데 이런 수단에서 행복의 상위가치를 찾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수단이 많다고 해서 더 나은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12 총기간의 선- 아름답고 선한 뜻 - 그 실현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1기의 선한 행복 - 2기이상 →선한 뜻의 실현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 아름답고 선한 뜻 + 그 실현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하는 상태
이상적 상태를 성취하는 방안도 다시 문제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또다시 위와 같은 판단을 행할 수 있다
- 지혜 (지혜는 있으나 행복하지 못함) vs 지혜가 없고 행복한 경우
즉 위와 같은 이상적 상태를 또 되도록 지혜롭게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수고와 고통은 적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적다.
그리고 얻는 좋음은 다양한 형태로 많다.
그러한 선교 방편을 통해서 그 상태를 성취한다.
- 결과 (지혜가 없으나 결과가 성취된 경우) vs 결과가 없는 경우 (지혜가 있으나 결과 성취되지 않은 경우)
- 선한 뜻 ( 선한 뜻은 있으나 성취 결과가 없는 경우 ) vs 선한 뜻이 없이 결과만 있는 경우
- 가치 단계 간의 상호관계
이렇게 가치의 여러 단계를 살폈다.
그런 가운데 먼저 각 단계의 가치를 비교해봐야 한다.
다음 두 유형을 놓고서로 비교한다.
A:
결과적으로 앞 단계의 무량한 양을 가정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0이라고 가정한다
B
한편 다음 단계가 1 단위가 되고 그 이전 단계는 0이라고 가정한다
이 A와 B 두 경우를 놓고 비교한다
그런 경우 A의 그 무량한 양이 다음 B 단계의 1단위의 가치를 넘지 못한다.
( → 현재 앞에 기술한 각 단계의 내용을 그렇게 조정해 나열한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처음 면적 배분에서 이렇다고 하자
기하학으로 정확히 측량해 어떤 이가 얼음 땅을 수억 헥타르를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심지어 생존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 면적이 크다고 단순히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것보다는 그 단계로 바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런 땅 하나도 없이 한달에 10 억원 수익을 얻는 경우가 낫다.
그런 식으로 각 단계에서 무한한 값은 그 이후 단계의 1이 갖는 가치를 넘지 못한다.
- 상위 목적 가치와 이로부터 가치를 부여받는 수단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간에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이전 단계와 목적과 수단의 관계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상위 단계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위 단계는 오히려 적거나 마이너스가 될 때 더 낫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 종교적 영역으로의 확대
여기까지가 일단 세속에서 생각하는 가치의 다양한 측면들이다
이렇게 살피면 가치 문제는 너무 복잡하기는 하다
그래도 결함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그것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게 된다
그런데 사실 가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사정으로 위 논의는 더 확대된다
- 종교적 가치 기준
- 사후 문제
특히 사후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의는 더 확장되게 된다.
즉 이는 가치 문제에서 한 주체가 고려할 기간을 얼마를 잡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된다.
즉 이는 다음 문제와 관련된다.
한 주체가 현실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다.
이것이 단멸관 문제다.
그 결론에 따라 판단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일생만 고려할 때의 가치 판단이 있다.
그리고 사후의 생을 함께 고려할 때 가치 판단이 있다.
이들은 통상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내게 된다.
[ 얻게 되는 좋음 * 기간 ]- [들어가는 비용이나 고통 * 기간 ]
이런 판단 과정을 통해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으로 많은 좋음의 총량을 얻고자 하는 원리 자체는 다르지 않다.
- 종교적 영역의 가치판단
한편 사후 관계를 모두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이 중요하다.
- 사후 다양한 세계의 문제 ( 하늘, 아수라, 지옥 ... 경험 초월적 세계)
- 고통이 없는 상태 vs 고통스럽지만 살아있는 생명 상태
한편 생사 과정에서 생사 고통을 없애는 상태가 갖는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
즉 생사 과정에서 <고통이 없는 상태 >가 갖는 가치를 다른 상태와 잘 비교해야 된다.
고통이 지속되고 끝나지 않을 때는 생존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고통이 없는 상태 >가 갖는 가치를 반대로 <생존 그 자체>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다
- 고통이 없는 생존 vs 고통이 없는 죽음 vs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항목의 성취
한편 생사 현실에서 <생명과 신체>와 <다른 항목 >들의 가치 비교가 문제된다.
이를 통해 <생명>은 < 생존을 전제로 향유하는 좋음들>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는 단멸관을 취한다고 하자.
또 생노병사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자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에 이어지는 삶을 전제한다고 하자
또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방법을 전제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함께 살펴야 된다
여하튼 고려할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열된다
그것이 모두 가치 판단 문제와 다층적으로 관련 연동된다
그래서 함께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후 관계를 고려할 때 가치 문제는 곧바로 수행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는 이하 수행 부분에서 살피는 주제와 밀접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앞에서 살핀 문제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 사후에도 보존되는 자산 문제
사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문제가 또 제기된다
개인적으로는 죽어도 갖고 가지 못하는 자산이 많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그렇지 않다.
쉽게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순간만 놓고 보면
우유 1톤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금도 1억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 이 각 경우에서 어떤 자산을 보유하던 지금은 같다.
그런데 우유 1톤은 1주일 지나면 썩게 된다.
이 때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문제가 된다.
금 1억은 이와 다르다.
한편 현금은 각국이 계속 발행한다.
인플레가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또 어떤 종목은 가치가 오르기도 한다.
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처인가는 알기 힘들다.
그런데 단 한번 종목 결정시에도 이렇게 모른다고 하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종목을 옮겨 다니면 수익이 생기기 힘들다.
한번은 요행히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뢰밭에서 뛰어다니는 형국이 된다.
그래서 한번 수익을 요행히 얻는다 해도 계속 그런 상태면 결국 망하기 쉽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 있다.
단 만원이 없어서 생계를 잇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 경우는 단 만원을 희사해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 준다.
그런데 원래 어른 남자가 그 생계를 책임진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현실에 있다.
사고로 과부가 된 경우가 있다.
또 생계를 책임질 부모가 없어진 경우가 있다.
고아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늘창고가 된다.
이곳에 식비 정도만 기증해도 높은 수익이 생긴다.
만원 = 생명의 가치가 얻어진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는 생사과정에도 안 없어진다.
돈을 자신이 보유하면 자신이 죽어서 지니고 가지 못한다.
자신이 그렇다고 하다.
그러면 자신의 상속인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비용 계산을 못한다.
자신이 하루에 들어가는 생명 신체 소모비용을 넘는 수익을 도저히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낙타 곰 벌과 같은 노릇만 한다.
그리고 생사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 사후자산의 획득수단
진정한 보물과 획득수단이 문제된다.
이는 죽어서도 계속 지닐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항목이 된다.
현실에서 당장 눈만 감아도 그 가치가 없어지는 항목이 있다,
반대로 그런 순간에도 계속 지닐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 지니게 되는 내용도 있다.
그런 여러 내용 가운데 보물로서 가치를 갖는 항목이 있다.
반대로 쓰레기나 사후 고통을 주는 폭발물의 성격을 갖는 항목도 있다 (→업의 장애)
그리고 보물은 일단 그 정체가 무엇이든 그로부터 좋음을 얻을 수 있다.
그 좋음은 앞의 여러 가치 단계들에서 살핀 여러 항목들이 된다
그래서 예를들어 만족, 줄거움 ..... 아름답고 선한 희망, 의욕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고 시세가 차이기 높이 발생한다고 하자.
그래도 그로부터 좋음을 얻지 못하고 나쁨을 얻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는 결국 좋음을 얻게 되는 방안 수단과 관련된다.
무엇인가가 그런 좋음을 가져다 준다고 하자.
또 그런 좋음을 얻게 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그렇게 얻어진 좋음도 여기서의 보물이 된다
불교에서는 3보와 10무진장, 7재 및 10선법, 3학, 10바라밀 등 여러 수행 방안이 모두 이와 관련된다
그리고 다음 기초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마호멧트나 예수님 부처님이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다.
불경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서 부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투자처로는 부처님이 최고다.
강도에게 만원을 기부하는 것
재벌에게 만원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에게 만원을 기부하는 것
그것이 다 같지 않다.
수행자 간에도 다음 차별이 있다.
부처님 > 연각 > 아라한 > 아나함 > 사다함 > 수다원
....> 기타 천신 > 현실에서 유력자 ....
이런 각 경우 수익률이 다 다르다.
그런데 부처님은 현실에서 만나기 힘들다
그런데 생계가 어렵고 질병이 많은 일을 돕는 것이 그런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다.
- 수행은 결국 이런 가치들과 모두 관련된다
이하에서는이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살필 부분을 뽑아서 살펴 나간다
▲▲▲-------------------------------------------
이상의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11장_종교학_(9).txt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001.txt id="029"
-------------------------------------------
♥Table of Contents
▣- <시장가격>에 의한 판단
오늘날 필요한 물건을 대부분 <시장>에서 구한다.
그래서 <시장>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
<시장>에서는 물건마다 <가격>이 숫자로 매겨진다.
그래서 <시장가격>은 대부분 뚜렷이 명확하게 의식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시장가격>을 곧 <가치 기준>으로 잘못 여기기 쉽다.
그래서 <시장가격>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 가치>를 평소 잘 분별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실질 가치> 및 <효용>과 시장가격
시장 가격은 물건을 사려는 이와 팔려는 이의 수와 그 물량에 주로 의존한다.
사려는 이가 갖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팔려는 이가 갖는 동기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이 적고 구하는이가 많다고 하자.
그러면 <시장가격>이 높아진다.
반대로 시장에서 물건이 많고 구하는이가 적다고 하자.
그러면 <시장가격>이 낮아진다.
- 시장 가격과 가치의 관계
<시장가격>은 물건 거래 시에 형성된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기능한다.
그런데 거래가 목적이 아닌 물건이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지니고 사용함>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추억으로 지니는 <기념품>과 같다.
이 역시 <시장가격>은 낮을 수 있다.
그리고 본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시장가격>은 가치의 척도가 되기 곤란하다.
이런 경우는 <가치>가 높아도 그 특성상 남에게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 및 <신체>도 이와 같다.
예를 들어 <눈>과 <귀>, <손>과 <발>과 같은 것이다.
또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성격>이나 <생활 경험>도 그렇다.
그 외 <부모>나 <가족>, <그 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삶>에서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에서 매매 거래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 <그 가치>를 잘 의식하지 못한다.
<가치>를 헤아려도 단지 모호하게 헤아린다.
그래서 명확히 <의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가치가 높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나 높은 지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저 <대강 높다>고 모호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들을 <상실할 상황>이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비로소 <그 가치>를 뚜렷하게 의식한다.
그런데 오직 <시장가격>만 고려해 선택한다고 하자.
그러면 <소중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쉽다.
- 시장 가격과 효용의 관계
한편 <시장 거래 가격 >과 이를 구해 <소비하여 얻는 효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그러면 그 만큼 <효용>을 많이 얻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반면 <시장가격>이 싸다고 하자.
그러면 <효용>이 적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시장 내 교환가격>과 <효용>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만을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자.
이런 경우 <시장가격>은 <효용>을 얻는데 들이는 비용일 뿐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여 얻는 효용이 있다.
이는 <숫자>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비용>인 <시장가격>만 명확하게 의식된다.
그래서 <시장가격>만을 곧 <효용 가치>로 판단하기 쉽다.
그런 경우 <왜곡된 가치판단>을 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흔하다.
그래서 <시장가격>이 낮다.
그러나 <사용 시 얻는 효용>이 큰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이다.
이 효용은 이것을 지니고 있고,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좋음이다.
이는 그것이 없고 사용하지 못할 때 겪는 불편과 고통 나쁨과 대비된다.
♥Table of Contents
▣- <눈에 보이지 않은> <수익>과 <비용>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
오늘날 이는 <시장>을 통해 구한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수행자>나 <일반인>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한편 오늘날 <시장 판매>를 위해 <재화> 및 <용역>을 <생산 공급>한다.
그런 가운데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한다.
또 상인은 시장에서 매매 행위를 통해 <차익>을 구한다.
이런 경우 <시장가격>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이런 입장에서 매 순간 <시장가격>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런 가운데 <시장가격>이 <가치척도>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한편, 시장에서는 <흔한 것>은 가격이 싸다.
그리고 소수만 가질 수 있고 <희귀한 것>은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소수만 갖는 <희귀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소수만 차지하는> <지위>나 <명예>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가치판단>을 행하기 쉽다.
한편, <교환>에는 <화폐>가 사용된다.
<화폐>는 다양한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는 <교환가치>를 대표한다.
그래서 <화폐 보유액>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가운데 <삶>에 임하기 쉽다.
그런데 <올바른 가치판단>을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과 비용을 잘 헤아려야 한다.
한편 <화폐>의 <실질 가치>도 잘 헤아려야 한다.
현실에서 <좋음>을 얻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누구나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
그것은 <사업>이거나 <취업준비 활동>일 수 있다.
이는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그 결과로 얻는 <이익>, <복덕>이나 <손해>, <고통>을 미리 헤아려야 한다.
또 다른 <선택 결과>도 함께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장래 이익 대부분>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선택으로 받을> <고통>이나 <손해>도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도 헤아려야 한다.
그런데 <그런 비용>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빠뜨리기 쉽다.
그런 가운데 판단하기 쉽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내용>만 놓고 선택해나가기 쉽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임하기 쉽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함께 전반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
어떠한 <좋음>을 얻으려 한다.
그런 경우 일정한 <노력>이나 <비용>, <고통>을 치른다.
한편, 이를 통해 <수익>을 꾀한다.
이 경우 <수익>은 <비용>보다는 커야 한다.
이를 오늘날 회계에서 [이익 = 수익 - 비용] 식으로 제시한다.
이 경우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부터 먼저 잘 헤아려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
무언가를 생산할 경우 하고 활동할 경우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소모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기계>, <건물> 등이다.
이는 <토지>나 <현금> 등이 일정 기간 그 가치가 비교적 유지되는 것과 다르다.
이런 경우 <그 소모분>은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소모되는 부분>은 <비용>으로 잘 헤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현금> 1억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1억짜리 <자동차>를 구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자동차는 일정 사용 후 <폐차 처분>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폐차 직전>까지 자동차는 잘 굴러간다.
그래서 자동차가 매 순간 얼마나 <가치>가 떨어져가는지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매 순간 <소모 부분>을 <비용>으로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전체 <수익-비용> 판단부터 잘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차되기 전까지 자동차로 9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자.
그러면 9천만 원 전체를 자동차로 얻은 <이익>으로 잘못 여기기 쉽다.
자동차 <가치 소모 부분>이 명확하게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폐차 후>에는 그 비용 액이 명확해진다.
이 경우 처음 <현금> 1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보자.
그러면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오히려 천만 원을 <손해>를 보았음을 이해하게 된다.
일정기간 <가치가 점차 소모되어 가는 요소>가 있다.
이 경우 <그 소모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일정기간별로 <그 소모분>을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회계에서 <'감가상각비용>'이라고 표현한다.
일반 <법인회계>에서 <건물>, <기계> 등에는 이런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해 임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타인에 <노동>을 제공한다.
그런 경우 <각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 <소모부분>을 <비용>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이는 소풍을 놀러 가서 인원을 셀 때 정작 <자신>은 빠뜨리고 세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생명>과 <신체>가 조금씩 소모된다.
그리고 사람은 100년이 지나지 않아 <생명>과 <신체>가 사라진다.
따라서 <사람이 활동함>에는 어느 경우나 <생명>과 <신체>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던 공통적으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일체 활동>에 공통 적용된다.
따라서 활동을 할 때는 최소한 <그 비용>을 넘는 <가치>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을 통해 <이익>보다는 <손해>를 얻는 것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의 <화폐가치> 환산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파악해 삶에 임한다.
이런 경우 그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모호하게 파악하기 쉽다.
예를 들어 막연히 <가치>가 높다는 식으로만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숫자>로 바꿔 표현해보자.
이 계산을 위해 먼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가치>부터 헤아려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저울 양쪽에 문제되는 <두 내용>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딱 하나만 취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럴 경우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물론 <좋은 것>을 다 함께 갖기를 원할 수 있다.
그래도 각각의 <가치 우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위와 같이 이 가운데 <하나>만 취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런 가운데 <우선순위>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는 <주관적>으로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물론 <객관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
객관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양한 내용>을 잘 고려한다.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용>도 잘 고려한다.
그리고 <다른 주체> 입장도 고려한다.
그리고 각 선택 이후 <인과상 결합>된 <과거>와 <장래> 내용도 고려한다.
또한 각 단면에 <숨어 있는 여러 측면>도 모두 잘 찾아내 고려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라고 하자.
<자신>이 이를 통해 사용하며 얻을 <효용>도 헤아린다.
한편 <다른 주체 입장에서 얻는 효용>도 고려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래 얻을 수익>도 잘 헤아린다.
또 그 <양>과 <유지 기간>도 고려한다.
그 상품의 <다양한 기능>과 <특질>도 고려한다.
한편 <이를 얻는데 들이는 희생>이나 <비용>도 고려한다.
이외 가능한 <여러 측면>을 함께 종합적으로 헤아린다.
그런 가운데 <비교 판단>한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하나만 최종적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통해 무엇을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가치를 평가해본다.
먼저 <각 내용>을 저울에 놓고 가치를 비교한다.
그런 경우 다음처럼 <가치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가치 > 우주의 가치 > ... 세계 각국의 자산액 > 1년 국가예산액 (2020년 대략 500조 이상)
이는 <다음 사정> 때문이다.
자신이 <우주>를 다 갖는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일체가 다 함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주>나 <다른 것>들을 일일이 나열해 <우선순위>를 분별할 의미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 예산액>보다는 <세계 각국의 자산액>이 더 가치가 크다.
그리고 이보다는 <우주>가 더 가치가 크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결국 <우주>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부등호>는 최소한 다른 쪽보다는 더 가치가 큼을 의미한다.
이는 <생명>과 <신체>의 가치를 <화폐가치>와 비교하기 위한 식이다.
결국 <화폐액>으로 파악할 수 있는 큰 항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은 죽음에 임박한 순간까지도 계속 유지된다.
<소모된 부분>과 관계없이 계속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크게 여긴다.
<각 주체>는 죽는 순간 직전까지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소모되는 내용>은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생명과 신체 소모분>은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과 신체>는 한 생에서 100년이 지나지 않아 끝내 소멸된다.
따라서 자신이 활동하는 경우 이를 결국 <건물이나 자동차, 기계>처럼 생각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소모되어 사라진다.
결국 <생명의 가치>를 각 기간별로 평균해 <소모부분>(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한 위 내용을 기준으로 <화폐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평소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음 식>을 화폐액 환산에 활용해보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가치 > 500조
이런 생명이 최대 100년을 넘지 않아 소멸된다.
그런 경우 1년당 평균 최소 5조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모된다.
한편 이 소모분은 하루당 최소 137억 원을 초과한다. (>) [생명 신체의 감가상각비용]
<한 주체>가 무언가 활동한다.
이런 경우 공통적으로 <이런 가치>를 소모한다.
따라서 평소 활동할 경우 최소한 <이런 비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이익>을 얻는다.
이는 <수행자>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이익 = 수익 - 비용]의 <회계 원칙>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최소한 그렇게 임해야 한다.
하물며 <수행자>는 더더욱 그렇다.
수행자는 <생사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를 벗어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더욱 명확히 의식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비용>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외관에 보이는 내용>만 놓고 살아가기 쉽다.
그런 활동으로 <약간의 가치>를 얻어낸다.
그러나 <그 가치>가 이런 <감가상각비용>조차 넘지 못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활동으로 <손해>를 본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해 하루당 <137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다.
<이런 손해>가 계속 쌓이게 된다.
이런 경우 <외관상 눈에 보이는 자산>은 늘어 날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생명과 신체 소모분>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쌓여간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쌓인다.
이로 인해 <처음의 자산이 줄어든 상태>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은 <자산>이 건물 1채 이었다고 하자.
그리고 일정기간 활동 후 건물이 2채가 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다음 상태라고 이해해야 한다.
처음은 건물 1채 + 생명신체 [ (>) 500조원 ]
뒤에는 건물 2채 + 생명신체 [ (>) 1조원 ]
<눈에 보이는 건물>만 고려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된 것처럼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신체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이 경우 오히려 <자산>이 크게 감소된 상태로 이해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평소 <자동차>를 가지고 일정한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그래서 <현금 수입>을 얻어낸다고 하자.
이 경우 <눈에 보이는 현금액>은 외관상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평소 <자동차의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치 소모분>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폐차장에서 페차되면서 <비용정산과정>을 거친다고 하자.
그러면 <평소 보이지 않던 손실액>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 시점>에서도 그 자산상태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다음 상태라고 미리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 시점은 현금 100만원 + 자동차 [ (>) 9000 만원]
일정시기가 지난 뒤는 현금 5100만원 + 자동차 [ (>) 100 만원]
이런 경우 이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현금액>만 고려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산>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동차의 가치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이 경우 오히려 그간 사업활동으로 <자산>이 크게 감소된 상태로 이해하게 된다.
세속에서 <집착>하는 내용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이런 <소모분>도 충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치 없는 내용>들이다.
<생명과 신체의 가치>와 비교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들은 <먼지>나 <티끌>처럼 <가치>가 적다.
보잘 것 없다.
따라서 평소 <가치 관련> <회계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가치>가 적은 <세속 일>에 관심이 제거된다고 하자.
그러면 비로소 <가치>가 높은 <수행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화폐>의 <실질 가치>와 <시장가격>
사람은 노동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다.
이 경우 <생명과 신체>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용역>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다.
또 <법인>은 이를 <비용>으로 반영한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개인의 생명과 신체>는 소모된다.
한편 <개인 사업자>도 같다.
또 <법인을 소유해 경영하는 이>도 같다.
즉 이런 경우에도 <개인의 생명과 신체>는 소모된다.
그래서 <이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일일이 반영해야 한다.
또 <이런 활동>으로 상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상품에도 <이런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이 내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먼저 <화폐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화폐는 <다양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폐는 1000원이든 1억이든 <단위당 가치>가 같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화폐는 <구매하는 재화>에 따라 <그 실질가치>도 달라진다.
그래서 각 경우 <화폐 단위당 실질 가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생존하려면 <최소 생계비>가 필요하다.
<이 금액>이 있으면 그 주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없으면 <죽음>에 내몰린다.
그런데 화폐가 <이런 부분>에 소모된다.
이런 경우 <생계비 해당 화폐액>은, <생명의 가치>와 거의 같다.
그러나 화폐액이 <이 범위>를 넘는다고 하자.
그러면 <화폐 가치>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유 화폐액>이 수조원대로 많다.
그런 경우 <구매가능한 자산>도 많아진다.
그래도 그에 비례해 <삶의 기간>을 늘릴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없다.
옷을 <수십 벌> 입을 수도 없다.
<잠자는 공간>을 일정 범위 이상 늘릴 도리도 없다.
결국 <생계비를 넘는 화폐액>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생계비>를 한도로 화폐의 <실질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사정 때문에, <화폐 실질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화폐액>과 <생명 신체>의 관계는 다음처럼 평가한다.
<생계비>가 최소 한 달 3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 30만원>은, <생명신체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생명 신체 가치 = 생계비 해당 화폐액 (30만원) > 생계비 초과 화폐액 500 조
이 식은 <처음에 제시한 식>과 조금 달라졌다.
<화폐의 실질가치>가 <각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화폐 소득>을 얻는다.
이 경우 <생계비>(예 30만원)를 경계로 <실질가치>가 달라진다.
<생계비 충당 화폐액>은 <생명 신체 가치>와 버금간다.
사람이 활동함에 따라 <생명 신체 가치>가 <소모>된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소모분>을 훨씬 넘는 가치를 획득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범위를 넘는 부분>부터는 또 사정이 그렇지 않다.
이처럼 <생계비>를 한도로 화폐 실질 가치가 다르다.
그러나 시장에서 <화폐>는 또 <차별>이 없다.
그런 가운데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에 의존해 정해진다.
<임금>도 <상품가격>처럼 <수요공급>에 의존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런 경우 현실에서는 <일정한 일 전체>를 하거나 않거나의 선택문제가 된다.
<생계비>를 경계로 <화폐 실질가치>는 다르다.
그렇다고 <생계비를 얻는 부분>까지만, 일하고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결국 <각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화폐보유액>이 많다고 하자.
그렇다고 보유액에 비례해 <생명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해 소비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또 <지위>를 얻거나 <다른 목적>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주관적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 <즐거운 맛>을 얻는데 기여한다.
<화폐>나 <재화>로 <이런 효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화폐>는 이런 효용을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런데 <화폐>나 <재화>를 얻는 과정에서 다시 일정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런데 <즐거운 맛과 효용>을 얻으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이 경우 <이를 얻는 방안>은 다양하다.
따라서 반드시 <화폐로 구매한 재화나 용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원한 공원>, <공기 맑은 숲>, <가정 내 화목한 대화> 등도 <즐거운 맛>을 얻게 한다.
따라서 <즐거운 맛>을 얻기 위해 <화폐>나 <상품>에만 의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
<화폐>로만 <가치>를 따진다고 하자.
그런데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공기>는 팔고 사지 않는다.
우선 <그 성격상 거래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눈>과 <심장>, <손>과 <발>과 같은 경우다.
이런 경우 <화폐>로 거래되지 않는다.
돈이 많아도 <돈>으로는 끝내 구할 수 없다.
거래되지 않기에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 <무시>하고 <외면>하기 쉽다.
그렇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내용이 <삶>에 많은 효용을 준다.
오히려 <시장에서 화폐로 구매 가능한 것>보다 많은 효용을 준다.
따라서 <가치>가 높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가치>가 대부분 높다.
그래서 <돈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저울>에 두 내용을 올려놓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 설 때 <그 가치>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돈>을 취하고, <심장>을 포기할 경우가 드물다.
<한쪽 저울의 화폐액>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따라서 <화폐>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부등호 기호>를 통해서라도 가치를 <숫자>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 가치>를 명확히 의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들의 <가치>를 모호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오로지 <시장가격>과 <화폐 보유액> 자체만 집착하기 쉽다.
그러면 오히려 <가치가 높은 것>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의 가치>는 <화폐>로 도저히 환산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한 500조원보다는 높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 명확히 가치를 의식해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 가치판단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L'amitié Françoise Hardy
https://youtu.be/mBQmFhQJWOE?si=qvowpOMEitlj2euc
♥Table of Contents
▣- <쓰레기>와 <보물>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익> 및 <자산>을 얻기 위해 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냥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통해 <쓰레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고통>과 <불쾌> <번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폭탄>을 만들어내는 경우와 같다.
그래서 <각 항목의 특성>을 먼저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가부터 잘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보물>은 다음과 같다.
<그 정체>는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
그것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낮을 수 있다.
또는 아예 <거래>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가 그것을 대할 때마다 <온갖 좋음>을 얻는다고 하자.
예를 들어 그것을 대하면 <만족감>을 얻는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재미>와 <웃음>을 얻는다.
그리고 <보람>과 <가치>도 느낀다.
또 <평온감>과 <안정감>을 얻어낸다.
그리고 새로운 <아름답고 선한 희망>과 <의욕>을 매번 일으키게 된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물>이다.
<보물로부터 기대하는 온갖 좋음>을 그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골동품>이 시장에서 대단히 <가격>이 높을 수 있다.
<하나의 도자기>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물>로 여긴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를 대해 <위와 반대되는 내용>만 얻는다고 하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고 하자.
그것을 대하면서 <불만>을 느낀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잘못 속아서 예상한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고 하자.
그래서 이를 대하며 <불만>과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다가 그 도자기가 깨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에 <슬픔>을 느낀다.
또는 가격이 떨어져 <우울>해한다.
한편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사치품을 구해 사용하는 자신을 <비난>한다.
그래서 자신은 <죄책감>을 갖고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에 대해 <질투>와 <시기심>을 갖고 대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 훔쳐갈 것 같아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상태로 지낸다.
또 그로 인해 <번뇌>만 자꾸 늘어난다.
또 이를 대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좋은 희망>이나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만일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가격>은 비싸다.
그러나 그로부터 <번뇌>와 <고통>만 얻는다.
그런 경우 값비싼 <폭탄>이나 <덫>과 같다.
그렇다면 값이 비싸더라도 <보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쓰레기>보다도 못하다.
한편,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넘는 <가치>를 최소한 얻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던 <생명신체>가 소모된다.
<이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화폐로 환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하루당 137억 원을 초과한다.
<'현금'을 얻는 사업> 가운데 <이런 수익>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돈으로 거래되는 품목>은 대부분 이런 가치를 넘지 못한다.
위 숫자는 또한 <부등호>로 대략 표시한 금액이다.
이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실에 <이런 가치>를 얻는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돕는 <봉사 활동>이 이런 부분에 속한다.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도 사정이 같다.
또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는 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끝내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른 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른 이를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가 현실에 <무량>하다.
그것이 결국 <수행>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수행 분야>를 살펴보기로 하자.
※
Les parfums de sa vie (Je l'ai tant aimée) Art Mengo
https://youtu.be/1yNMKXatKwY?si=3Mv097uyGjG_knEB
♥Table of Contents
▣- <수행>으로의 전환 계기
현실에서 <가치가 적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가치가 보다 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가치가 큰 것>을 놓친다.
<가치가 적은 것>은 버리고 <가치가 큰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자세가 현명하다.
그런데 <한 정지된 단면>을 대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가치판단>을 잘 행하지 못한다.
<그 사정>을 이미 다양하게 살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우선 여러 사유로 <외관>에 내용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장의 감각, 느낌>에 치중한다.
그리고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초점> 밖에 잠재되어 있는 측면들은 무시하게 된다.
한편 <인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인과로 묶인 과거와 미래>의 내용도 무시된다.
한편 <시장에서 표시되는 가격>에 치우쳐 가치판단을 행한다.
그리고 명확히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무시한다.
이런 여러 현상들로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판단>을 행한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는 판단이 더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잘못된 방안>으로 추구하게 된다.
<세속>에서는 주로 <당장 눈에 띄는 외관>에 치우친다.
그래서 <가치가 낮은 항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먼저 올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판단>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수행>에 가까워진다.
이를 위해 우선 <생명의 가치>부터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세속에서 <집착하는 것>들이 많다.
이들과 <생명>의 가치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이들은 마치 <옷에 묻은 먼지>와 같다.
<생명의 가치>는 화폐로 환산하면 500조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한편, 현실에서 대부분 10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생명과 신체>는 매일 조금씩 가치가 소모되어 없어진다.
이런 경우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을 화폐로 환산해보자.
그러면 하루당 최소 137억 원을 초과하는 가치가 소모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가 <활동>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생명과 신체의 소모비용>을 넘는 <수익>을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높은 가치>를 갖는 항목을 찾는다.
그런 경우 세속에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이를 찾기 힘들다.
이런 항목은 주로 어려운 이를 돕는 <봉사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당장 <생계해결>이 힘든 이들이 많다.
<고아>나 <홀로된 과부>나 <노인>이나, <병자>들의 경우다.
이런 경우 이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얼마간을 베푼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 <이런 도움>이 없으면 홀로 <생존>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생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결국 다른 이가 <생명>을 이어가게 해준다.
물론 그로 인해 <당장 이익을 얻는 것>은 그 <상대>다.
그렇지만, 이런 <가치> 자체는 <그런 행위를 행한 이>가 얻어내는 가치도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활동에 들어가는 <생명과 신체의 가치 소모분>을 넘는 <수익>이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단지 <더 많은 현금>을 얻기 위해 활동한다.
또 <즐거움>만을 얻기 위해 어떤 소비를 한다.
그런 경우 그것이 없다고 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다만 <약간의 즐거움>을 얻는 것뿐이다.
그러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거움>을 얻어낼 방안은 무량하다.
그리고 이런 각 경우 <그 가치> 차이가 대단히 크다.
한편 화폐소득을 얻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그런데 얻어진 <화폐소득>이 이런 분야로 재투자된다고 하자.
그러면 또 이로 인해 <그 화폐의 실질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활동의 실질가치>도 다시 달라진다.
어떤 이가 <한 생>에서 건강하게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자.
<이 내용이 갖는 가치>가 크다.
그런데 <수행의 가치>는 이런 경우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다음 판단>이 특히 중요하다.
우선 <생사 이후>를 고려하는 자세가 전제된다.
그래서 먼저 <단멸관>을 잘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3악도의 생사고통>을 제거함이 중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일단 기본적인 <인천교>적인 수행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과 <인간세계>를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단 <'생사고통>'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후 <'생사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제거함>이 갖는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고통이 없음>의 <가치>
현실에서 <좋음>을 적은 <비용>으로 얻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세속>과 <수행>의 방향이 크게 다르다.
<세속>에서 많은 것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명예나 지위, 부를 추구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고 부러워하는 상태가 많다.
그런데 <수행자>는 이런 것을 외면한다.
그리고 <수행>을 향해 간다.
그래서 <이 사정>을 먼저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먼저 현실에서 문제되는 <각 내용>을 저울에 놓는다.
그리고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처음 다음 식을 제시한다.
○ 생명과 신체의 가치 > 우주 > 500조원
500조원이 있어도 <생명과 신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 <화폐>는 각 경우 따라 그 <실질가치>가 다르다.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없으면 죽게 된다.
그래서 <그 가치>가 <생명과 신체>의 가치에 준한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1인의 <생계비>를 3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런 경우 다시 다음 식을 제시하게 된다.
○ 생명과 신체의 가치 ~ 생계비(30만원) > 우주 > 500조원
그렇지만, <생명>이 모든 가치의 최고는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계속 받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 상태에서 몇 분만 있어도 차라리 <삶>을 포기하려 하게 된다.
살아가는데 <고통>을 조금 겪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두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고통>을 참고 견딘다.
그러면 또 <좋은 상태>가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또 <고통>을 참고 견뎌가게 된다.
그러나 어떤 <고통>이 대단히 극심하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고 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런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음 같은 가치 서열을 제시하게 된다.
○ 죽음 > (극복하기 힘든 심한 고통을 겪는 상태)로서 생존 (생명)
처음에 다음 식을 제시했다.
○ 생명과 신체 ~ 생계비(30만원) > 우주 > 500조원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하자.
이런 경우 그 주체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모두 다 함께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이 경우 우주나 500조원의 우열을 따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하 항목은 단지 <객관적 입장>에서 우열을 나누는 것뿐이다.
○ 생명과 신체 ~ 생계비(30만원) > 죽음 ( 우주 > 500조원 > 0 )
그런데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상태로서의 생존 (생명)은< 죽음>보다 못하다.
그래서 다시 다음처럼 묶어 표시하게 된다.
○ ( 견딜만한 상태로서) 생명과 신체~ 생계비(30만원) > 죽음 ( 우주 > 500조원 > 0 ) >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생존
결국 <극복하기 힘든 고통>이 없는 상태가 중요하다.
이는 우주나 500조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
반대로 <극복하기 힘든 고통>이 있는 상태라고 하자.
그것은 <죽음>보다 못하다.
결국 <극복하기 힘든 고통>의 있고 없음의 가치차이가 크다.
그런데 <수행>은 삶에서 <생사고통>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이 목표다.
따라서 그 가치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잘 한다고 하자.
그러면 비로소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고려하는 기간>의 문제
한편, 한 주체가 <고려할 기간>을 잘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봄>만 생각하고 임한다.
그런 경우 <봄에 씨를 뿌리는 일>을 어리석다고 여긴다.
그러나 <1년>을 길게 보고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봄에 힘들더라도 씨를 밭에 뿌려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면 <가을>에 씨 하나당 100배가 넘는 수확을 얻는다.
<옥수수알>과 <옥수수> 관계와 같다.
짧게 <1년>만을 고려한 가운데 가치판단을 행한다고 하자.
이는 다시 <10년을 고려하는 경우>와 내용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Table of Contents
▣- 장기간에 걸친 인과 판단
<장기간에 걸친 인과판단>은 <정지단면에 대한 판단>보다 훨씬 어렵다.
단순히 <여러 항목>을 늘어놓고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자.
이 경우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내용>이 함께 복합된다.
그리고 <인과관계>로 묶여 이 각 내용이 구체적으로 불명확하다.
이런 경우는 판단하기 힘들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500조원>과 <생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자.
그러면 선택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로 얽힌 경우>는 판단이 어렵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문제가 제시된다고 하자.
어떤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면 <돈 400만원>을 얻을 수 있다. ~~ ( 그러나 그로 인해 <죽음>에 장차 처할지 모른다. )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한다>. ~~ ( 그러나 그로 인해 <죽음>에 처하지 않는다. )
이런 형태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각기 <첫 부분>만 외관에 드러난다.
<괄호 내용>은 선택과 <인과로 묶인 장래 내용>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각 주체가 이를 <고려>에 충분히 넣지 못한다.
그래서 당장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 이뤄진다.
매 경우 어떤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지 분명하지 않다.
<미래>로 나아갈수록 한층 파악이 어렵다.
<인과 문제>에서 지나치기 쉬운 문제가 있다.
<자신의 생명>은 <우주>보다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진다.
<자신의 생명>만 가치가 높다고 여긴다.
그런데 <다른 생명의 가치>는 가볍게 여긴다.
예를 들어 <벌레>는 가치가 적다고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면 <인과상> 자신도 <다른 주체들>로부터 가볍게 평가받게 된다.
<벌레>도 생명을 집착한다.
<벌레>도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높다고 여긴다.
<인간>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떤 이>가 벌레를 <해친다>.
그런데 해치기만 하고 <살리지는 못한다>.
이는 <부수기>는 잘 해도 <만들기>는 못하는 아이와 비슷하다.
<벌레>라고 해도 생명의 가치가 높다.
설령 자신이 <500조원>을 갖고 있어도 <벌레>를 다시 살려 내지 못한다.
어떤 이가 <벌레의 생명>까지도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자.
그래서 죽을 상황에 놓인 <벌레>의 목숨을 살려 주어 <방생>한다.
그러면 우선 그 벌레가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은 그 벌레가 <이익>을 얻는다.
그렇지만, 이는 그렇게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이>가 얻어내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수익>을 그런 이가 되돌려 받게 된다.
그것이 수행을 통해 얻는 <복덕>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잘 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다른 생명들의 주관적 평가 )
자신이 <다른 생명>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한다.
그런데 <다른 생명>도 또한 자신처럼 <다른 생명>에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
이는 서로 <인과 관계>에 놓인다.
이 관계를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다.
○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다른 생명들의 주관적 평가 ) =~ 자신의 <다른 벌레나 동물의 생명>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태도>
이는 다음 의미다.
<자신의 생명>이 객관적으로 존중받고 높게 평가받기를 원한다.
객관적 평가는 <다른 이>들의 <주관적 평가>가 모인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이>들의 <주관적 평가>는 자신의 다른 생명에 대한 자세>와 관련된다.
자신이 <다른 벌레나 동물의 생명의 가치>를 평소 존중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벌레의 생명의 가치>를 500조를 초과한다고 여긴다.
그러면 자신도 <다른 생명>으로부터 그 정도로 평가받게 된다.
그런데 <다른 생명의 가치>를 50원 미만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 자신도 <다른 생명들>로부터 그 정도로 평가받게 된다.
생명은 제 각각 <자신의 생명과 생존>을 중시한다.
그런데 <다른 생명>이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생명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만큼 존중한다.
그런데 <다른 생명>이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이런 경우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생명의 가치>를 반대로 여긴다.
그리고 <각 생명>마다 이런 형태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것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다른 생명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다른 생명들의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자신이 <다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 <다른 생명> 입장에서 그는 <생존에 도움을 주는 존재>다.
그런 경우 <그의 생명의 가치>도 함께 <다른 생명들>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반대로 오직 <자신의 생명>만 존중한다.
그리고 <다른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고 낮추어 평가한다.
이런 경우 <다른 생명> 입장에서는 그는 <생존에 위협을 주는 존재>다.
그런 경우 <다른 생명>들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마이너스>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가 하루 바삐 없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그리고 <각 생명>마다 이처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적 평가>란, 다른 주체의 <주관적 평가>들은 모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각 생명의 <주관적 평가>가 모아져 <객관적 평가>가 된다.
결국 <자신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는 이런 형태로 결정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는 결국 다른 생명에 대해 <그가 취하는 자세>에 의존한다.
즉, 자신이 <다른 생명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에 의존한다.
자신이 <다른 생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
그러면 <자신의 객관적 평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자신의 객관적 평가치>를 높이려 한다고 하자.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을 널리 받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이전에 자신부터 <다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된다.
그런데 수행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함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수행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Table of Contents
▣- <단멸관>과 수행
한 주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경우 <그 주체와 관련된 것>은 모두 <끝>이라고 여긴다고 하자.
이런 견해를 <단멸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가 <단멸관>에 바탕해 삶에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폐해>가 심하게 된다.
현실에서 <한 생>의 기간만 고려하며 가치를 판단하는 입장도 있다.
또 한편 <무한한 기간>에 걸친 윤희생사를 고려하며 <가치>를 판단하는 입장도 있다.
이 두 입장은 그 차이가 크다.
<단멸관>을 취한다고 하자.
이 경우 <자신의 사후> 자신과 관계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로지 <한 생>만 고려해 가치판단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 경우,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좁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 고려한다.
그리고 <짧게>, 자신의 1생의 기간만 고려한다.
비록 그가 자손까지 고려하더라도 그 기간은 제한적이 된다.
그리고 <얕게>,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측면만 고려한다.
그런 가운데 좋음을 집착해 추구한다.
그리고 <인과 관계>도 역시 이처럼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한다.
그런 가운데 목표에 대해 <잘못된 방안>을 찾는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매순간 행하게 된다.
이처럼 <단멸관>을 취해 짧게 한 생만 고려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처럼 생각한다.
<죽음 이후> <이를 이어가는 주체>는 없다.
그래서 <죽음>으로 자신과 관련된 일체가 다 함께 의미를 잃는다.
또한 그가 쌓은 가치나 자산이 <죽음>과 함께 없어진다.
이렇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좋음>과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넘는 <수익>을 얻어야 <이익>을 얻게 된다.
어떤 이가 <원료나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하자.
이 과정에서 <원료나 재료>는 투입되어 모두 사라진다.
그런데 <토지, 현금>은 <살아 있는 동안 까지는> 가치가 유지된다.
그런데 <기계, 건물> 등은 그 성격이 중간이다.
즉 <원료>처럼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토지>처럼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소모 된다.
그래서 기간별로 <그 가치소모분>을 비용으로 고려하게 된다. [감가상각비용]
<단멸관>을 취하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한편 <단멸관>을 취하는 경우에도 <생명>의 가치를 높다고 여긴다.
그리고 되도록 <삶의 기간>을 늘려, 오래 살고자 한다.
또한 <생명>에 집착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 가치의 경중>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숫자>나 <화폐액>으로 환산해 명확히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막연히 <생명의 가치>를 높다고 여긴다.
그런데 사람은 통상 100년을 넘어 살기 힘들다.
그리고 <생명 신체>의 가치는 <죽음>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평소 활동시 조금씩 <생명신체>가 소모 되어간다.
그래서 <생명과 신체>도 앞에서 본 <기계, 건물> 등과 성격이 같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비용>이나 <수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내용>을 평소 잘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명 신체>의 <가치 소모분>은 대부분 이를 생활에서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용계산>에서 빠뜨리게 된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생명과 신체>의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생명과 신체>의 가치를 의식하고 고려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살아 있는 동안 대단히 <가치가 높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를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잘 고려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단멸관>을 취한다고 하자.
그래서 오직 <살아 있을 동안>만 고려한다고 하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우선 <생명신체의 가치나 비용 수익>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자.
그래서 사는 동안 생명신체보다 <더 가치있는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자.
그렇다해도 그런 내용이나 가치는 <죽음> 이후 모두 사라진다고 여긴다.
또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생명신체보다 가치있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
또는 <손해>가 연속되어 <부채>만 쌓은 상태라고 하자.
그렇다해도 그런 <손해>나 <부채>는 역시 죽음 이후 모두 사라진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음 생>에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들을 고려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국 <마찬가지>라고 여기게 되기 쉽다.
그리고 <죽음> 이후 내용은 외면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는 단지 <살아 있을 동안> 얻고 누릴 <이익>과 <즐거움>만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비용을 외면하게 된다.
그래서 사는 동안 <현실화되지 않는> 내용은 외면하게 된다.
그리고 당장 <외관으로 눈으로 보이는> 측면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러나 <단멸관>이 옳지 않다고 하자.
그래서 죽음 이후 <다음 생>이 다시 이어진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명과 신체의 가치>를 고려해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일은 의미가 크다.
그 <수익과 손실>은 모두 다음 생에도 남아서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자.
예를 들어 <수익>이 남으면 <인간>이나 <하늘>세계로 태어나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자.
그러면 <아귀>나 <축생>,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 살아가게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차이>는 크게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입장>이 옳은가가 먼저 문제된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어느쪽으로도 단정짓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현명한 도박사>의 상태라도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경우의 가능성>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세히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처럼 판단하게 된다.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집>을 일으킨 상태라고 하자.
그래서 매순간 <근본정신>에서 일정부분을 취하여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런 경우 그런 상태로 무한히 <생사고통>을 받으며 <생사윤회>에 묶인다.
그래서 정작 <사후>에도 그 주체는 <망집>에 바탕해 계속 삶을 이어간다.
예를 들어 한 주체가 <사망>해 화장터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 <망집>을 기준으로 하면 <그 생명 신체>는 없어진다.
그러나 <그 주체의 근본정신과 기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망집>을 기초로 또 다시 사후 <다음 생>이 이어진다.
<6도 윤회과정>에서 <각 생명 형태>별로 수명과 복덕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후 <인간>과 <축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 경우 <각 생>마다 어떤 <업>을 행하였는가가 중요하다.
<업>에 따라 <그런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멸관>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잘못된 판단>으로 매순간 잘못된 <업>을 행해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경우 생사과정에서 <생사고통>을 반복해 겪는다.
즉, 이로 인해 생사과정에서 <아귀>, <축생>, <지옥>과 같은 <3악도>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로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받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선 사후 <3악도>에 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소 <업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덕>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행위로 <얻는 수익>과 <소모되는 비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는 <생명 신체의 소모분>(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할 의미가 크다.
평소 하루당 <생명신체 소모분>을 넘는 가치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복덕>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후 <생명의 상태>를 달리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수행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경우 이런 사정을 <이해하는 경우>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입장이 달라진다.
그래서 <수행자>와 <일반인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미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소모해 활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통해 최소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정도>의 가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생명과 신체>의 <가치>와 <그 소모분>을 고려하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를 자신의 활동의 <기본 자본>이나 <비용>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이가 <자신의 생명신체의 가치>를 500조원을 초과한다고 여긴다고 하자.
이는 자신이 삶을 시작할 때 보유한 기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소 1년당 <소모되는 생명신체의 가치>는 5조원을 초과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생명신체의 가치 소모분을 명확히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1년당 소모되는 <비용>이다.
또 그래서 그런 비용을 넘는 <수익>을 얻고자 평소 노력한다.
이들 <수익>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형태>도 있다.
그러나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도 있다.
그렇다해도 그런 <생명 신체> 소모분을 넘는 <수익>을 얻고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한편 <자산>은 각기 특성이 다르다.
현실에서 어떤 자산은 <눈>만 감아도 계속 지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눈을 떠서 보는 내용> 일체가 그렇다.
또는 우유처럼, 1주일만 지나도 <썩어 없어지는 형태>도 있다.
또는 기계처럼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유지하기 힘든 자산>도 있다.
이처럼 각 경우마다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자산 가운데는 생사과정에서 <생사를 이어 계속 지닐 수 없는 자산>이 있다.
또 그렇지 않고 <생사를 이어 계속 지닐 수 있는 자산>도 있다.
그래서 <수행과정>에서 이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무언가를 파악해야 한다.
경전에서는 가장 가치있는 자산으로 불,법,승 <3보>를 든다.
또는 수행자의 자산으로 <7재>나 <10무진장> 등을 든다.
신(信)ㆍ계(戒)ㆍ참(慚)ㆍ괴(愧)ㆍ문(聞)ㆍ시(施)ㆍ혜(慧)ㆍ염(念)ㆍ지(持)ㆍ변(辯)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우유처럼 <곧 썩어 없어지는 자산>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현실에서 취득했다고 하자.
그런데 오랜 기간 그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무량한 시간에 걸쳐 유지될 자산> 형태로 점차 이를 바꿔나가야 한다.
<생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생사과정에 걸쳐 길게 <좋음>을 얻고자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무량한 <시간에 걸쳐 유지될 자산> 형태를 취득해야 한다.
또는 점차 다른 자산을 <이런 형태>로 바꿔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갖고 행하는 <수행>이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단멸관>의 제거의 어려움과 믿음의 중요성
<단멸관>이 잘못임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리고 <생사과정>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윤회의 주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즉 <생사과정을 이어가는 주체>를 이해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평소 <자신의 정체>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존속기간>이 <한 생>에 국한되지 않는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먼저 <단멸관>을 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정>을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수행 분야에 들어간다.
결국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일단 <믿음>을 바탕으로 수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종교 일반의 현실부정 공상주의적 이상성과 불교
현실에 존재하는 <종교>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를 부정한다.
그리고 대신 <천국이나 하늘>, <지옥>과 같은 세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인천교]
예를 들어 <지옥>은 <고통>과 <두려움>이 극심한 상태로 장구하게 지내는 상태다.
반대로 <하늘>은 <즐거움>과 <희망>이 가득한 상태로 장구하게 지낸다.
한편 <각 종교>는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절대자>를 믿고 따른다.
그리고 <선>을 실천한다.
그래서 <사후>에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제시한다.
이처럼 종교는 <하늘>이나 <지옥> 등의 세계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현실의 사람>들이 당장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다.
즉, 살아 있는 동안, <현실>에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인정해 받아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현실 내용>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은 모두 <비현실적>이며, <공상적>이다.
그리고 <허구의 종교적 내용>이라고 여기기 쉽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가.
부처님도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아수라>, <하늘>과 같은 세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색계> <무색계> 하늘과 같은 <초경험적인 세계>를 제시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계 6도>의 내용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색계의 하늘 <범천>의 수명은 1겁을 넘는다고 제시된다.
이런 하늘 등에 태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처럼 장구한 시간동안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을 함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윤회설>을 제시한다.
그래서 각 생명이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무량겁에 걸쳐 <3계 6도>의 <생사 윤회고통>을 겪게 됨을 제시한다.
이는 또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현실>만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하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타화자재천>이나 <범천>과 같은 하늘도 인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3계 6도를 <윤회함>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공상적 허구 내용>을 제시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한편 불교는 전체적으로 <3계 6도>의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하늘>과 <지옥>을 제시한다.
그래서 불교는 <하늘에 태어남>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불교는 지옥 등 <3악도>를 우선 벗어나야 함을 제시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늘>과 <인간>을 오가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하늘에 태어남을 <궁극적 수행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히려 다음을 제시한다.
이런 하늘은 상상하기 힘든 <장구한 수명>을 갖는다.
그런 가운데 <복>을 누린다.
그런데 이 역시 모두 <무상>하다.
그래서 이는 전체적으로 생명이 <괴로움>을 받고 <윤회>하는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안락함도 <무상>하다.
그리고 결국 <끝>이 있다.
따라서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 목표 상태>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초월한 <더 높은 상태>를 목표 상태로 제시한다.
즉, <생사의 고통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목표로 제시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 입장에서는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한층 믿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생사현실>로 제시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처럼 <생사현실>을 관하는 것을 <올바른 관찰>이라고 한다.
이런 차이를 <비유>로 살펴보자.
<사람>이 누리는 수명과 복을 일반 <세균>이나 <곤충>의 삶에 비교해보자.
그런 경우 <인간의 삶>은 이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복>이 많고 <수명>이 길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이 <번뇌와 고통>에서 끝내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사정이 같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해도 이와 사정이 같다.
인간세계에 비해 <복>과 <수명>이 수승하다.
그러나 현실은 <무상>하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끝내 자유롭지 않다.
한편 불교는 생사현실 일체가 <무상>하고 <고> <무아> <공>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세속적 입장>을 부정한다.
그런 경우 불교 또한 <현실을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생사현실에서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따라서 이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망집>에 바탕한 <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생사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망상분별과 번뇌>를 제거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사고통의 윤회>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 <해탈>과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취지로 <세속>을 부정한다.
그리고 세속에서 현실에 갖는 <집착>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입장
<수행>에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단멸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먼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나열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현명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통해 비로소 <수행>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후>에 자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
이런 경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자.
그러면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닐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또 <죽음 이후>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이 가운데 어느 경우가 옳은지를 모른다.
그런 경우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후의 생>의 가능한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런 <사후의 생>은 전혀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
한편, 있어도 <어느 기간>까지만 그렇게 있다가 없게 될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사후 상태의 종류>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가운데 어느 형태로만 무한하게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경우를 함께 고려한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방안을 찾는다.
먼저 <사후의 생>이 없다고 하자.
그런 경우 오로지 <현재의 1생>만 고려한다고 하자.
그래도 <수행>은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수행은 <1생의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생>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수행>이 최상의 선택이 된다.
한편 한 주체가 <무한>히 이어지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수학에서 <무한>을 증명하는 것과 사정이 같다.
임의로 어떤 <가장 큰 수>를 정한다.
그래도 그 위에 1을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수를 <무한>하다고 하게 된다.
<한 주체의 변화과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생>과 <이전 생>과 <이후생>의 관계가 달라질 사정이 본래 없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무시무종의 시간대>를 나아가게 된다.
한편 생사 전후의 <업>과 <과보>의 구체적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계는 <수행>을 통해 직접 파악할 내용이 된다.
그런데 <수행>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들 내용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행을 통해 <복덕>과 <지혜자량>을 구족한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사정>과 같다.
<개미>와 같은 벌레가 있다.
이 <개미>가 <인간>의 삶의 과정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개미나 다른 곤충>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생사과정>에서 수행의 가치
<죽음>은 <생명과 신체>를 소멸시킨다.
그래서 <생명과 신체>를 기초로 한 <가치>를 소멸시키게 된다.
그래서 <생명과 신체의 소모분>(감가상각비용) 문제도 이로 인해 발생한다.
그런데 <단멸관>을 벗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망집>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서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부분>을 <자신>이라고 잘못 분별한다.
그런 경우 <그런 망집>을 기초로 해서 무량겁에 걸쳐 <생사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근본 정신>을 기초로 매생마다 <생>을 반복해 나가게 된다.
즉 <망집>을 기초로 매생마다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취하여 <생사윤회>를 반복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생사과정>을 통해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것만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지 현실에서 당장 <고통>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만 처해도 이를 견디기 대단히 힘들다.
예를 들어 소변을 3일간 참으면 500조원을 받게 된다고 하자.
설령 그래도 끝내 소변을 참아낼 도리가 없다.
결국 500조원을 받는 것보다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상태>를 선택하게 된다.
한편 평소 자신의 <생명>이 <우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
그래도 <참기 힘든 고통>이 계속된다.
또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려 하게 된다.
물론 <삶>이 대단히 가치 있다고 스스로 여긴다.
그렇지만 매순간 <고통>을 계속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형태로 <가치 순위>를 판단하게 된다.
[참기 힘든 고통을 받는 생존] < 죽음 ... < 500조원 < 우주 < [고통이 없는 생존]
이처럼 현실에서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
반대로 <고통을 벗어남>이 갖는 가치는 대단히 크다.
그런데 <생사과정>이 무한하다.
한편 이런 생사과정 중에 3악도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아귀, 축생, 지옥세계에 처한다.
이런 경우 단순히 죽음을 맞이해 <아무 것도 없게 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명과 신체> 가치가 0이 된 상태는 아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따라서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인간이나 하늘세계>에 태어난다.
그런 경우 <3악도의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와 차이가 크다.
한편 더 나아가 <생사 윤회의 묶임> 자체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한편 자신만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도 가치가 크다.
그런데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널리 <다른 생명>까지 모두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그러면 <그 가치>는 훨씬 크다.
그런데 <모든 생명>을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 <그 가치>는 다시 훨씬 크다.
그런데 <다른 중생>을 그처럼 도우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는 다시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 해 임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도울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부터 <생사현실>에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수행>은 이런 상태를 하나하나 성취하게 해준다.
따라서 <수행의 가치>는 무량하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가치판단>을 잘 행한다.
그래서 이들 <각 내용의 가치>를 잘 비교한다.
그러면 이들이 <태양>과 <먼지>처럼 차이가 큼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판단>을 통해 세속의 쓸데없는 관심을 모두 끊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비로소 <수행>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수행>에 전념해나가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가치의 <유지기간>과 수행을 통해 얻는 자산
현실에서 어떤 항목은 <일시적>으로 보전된다.
그러나 어떤 항목은 <1생 동안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항목은 <생사과정>을 넘어 계속 보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우유>나 <생선>은 곧바로 썩는다.
반대로 <금>이나 <보석>은 오래 간다.
그렇지만 이런 <금>도 생사과정을 넘어 지닐 수는 없다.
이들 재화는 <죽음> 이후 가져가지 못한다.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얻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당장 <눈>만 감아도 얻어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내용>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마음으로 <기억한 내용>은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올릴 수 있다.
한편 <생사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유지되는 것이 있다.
그 가운데 다시 좋음을 <무량>하게 주는 내용이 있다.
<수행을 통해 얻는 항목>은 <생사과정>을 넘어 계속 보전 가능하다.
그 가운데 다음 항목들이 가치 있는 <수행자 자산>이 된다.
3보 : 불ㆍ법ㆍ승,
7재 : 신ㆍ계ㆍ참ㆍ괴ㆍ문ㆍ시ㆍ혜,
10무진장 : 신ㆍ계ㆍ참ㆍ괴ㆍ문ㆍ시ㆍ혜ㆍ념ㆍ지ㆍ변
예를 들어 <믿음>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속속들이 몰라도 당장 <실천할 바>를 실천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곧바로 수행에 따른 <과보>를 얻게 해준다.
한편, 수행자가 <직접경험>이던 <간접경험>이던 <어떤 잘못>을 기억하고 반성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무량겁에 걸쳐 <같은 실수>나 <손해>를 보는 일을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발생할 손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는 반대로 <이익>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행자는 수행을 위해 먼저 <생계>를 해결한다.
그런데 생사과정을 통해 <계속 지닐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 있다.
수행자는 이들 자산이 무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이런 자산>을 얻어내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를 되도록 <적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량겁에 걸쳐 <가치 있는 자산>을 많이 쌓아가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갖기
<가치> 있는 품목을 얻어내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를 얻어내는 <방안>이 다양하다.
<어떤 물건>을 놓고 생각해보자.
어떤 물건은 길을 가다가 <주어> 얻을 수도 있다.
또는 원하는 물건은 직접 <만들어내> 얻을 수도 있다.
또는 물건을 <사고 팔아서> 얻을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이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대가>로 얻을 수도 있다.
또는 <범죄>적인 방안으로 얻고자 할 경우마저 있다.
또는 그냥 <노력 없이 거저>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그 방안이 다양하다.
이는 <수익>이 얻어지는 <인과> 판단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좋은 상태>를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기 위해 우선 <올바른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온 생명>이 <제한> 없고 <차별> 없이 <좋게 되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뜻의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가 우선 제거되게 된다.
그리고 <뜻의 성취를 방해하던 힘>은 <성취를 돕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 <뜻의 성취>가 상대적으로 쉽게 된다.
또 이런 사정으로 성취된 상태도 이후 오래 <유지>되게 된다.
그러나 뜻을 원만히 잘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그 <성취 방안>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좋은 뜻>을 가져도 성취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어려움>에 조금 부딪히면 곧바로 포기하기 쉽다.
그래서 먼저 <서원>을 일으키고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지혜>를 취득하게 된다. [4여의족, 욕,진,념,혜]
<좋은 서원>을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일단 생사현실에서 기본적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해나갈 <기본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후 <현실에서 얻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이를 꾸준히 <더 가치 있는 내용>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관념>이나 <언어영역>에서부터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마음안 내용>부터 <가치 있는 형태>로 채운다.
그러면 자신의 <의식>이 변화한다.
이후 <행동> → <습관> → <성격> → <인격> 등이 변화해간다.
그런 가운데 긴 과정을 <짧게 줄일 방안>이 있다.
일정한 <희망>을 갖는다.
그런 경우 그 희망이 <뜻과 같이 성취된 상태>를 먼저 그려낸다.
그리고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그런 희망이 <뜻처럼 성취된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 자신이 그 상태에서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하려하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당장부터 행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그런 경우 <당장> 그런 내용부터 먼저 실천해간다.
이는 <뜻을 다 성취한 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성취하는 것이 된다.
그런 가운데 <그 성취를 위한 방향>으로 노력한다.
그 노력도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행해간다.
그러면 그로 인해 <그 서원 전체>를 훨씬 쉽게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어렵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의 여러 단계와 <생사 고통> 제거 방안
생사과정에서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
그런 경우 먼저 <생사고통>의 <정체>와 <인과>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정체>를 먼저 잘 관한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을 잘 관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이 없어진 목표 상태>와 <그 방안>을 잘 관한다. [4성제, 고집멸도]
<생사고통>의 <발생과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주체가 어리석음, 망집, (탐진치) <번뇌>를 일으킨다.
=>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의업, 구업, 신업)을 행한다.
=>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출생단계 이전에 <근본 무명>에 바탕한다.
=> 그런 가운데 <망집번뇌>를 일으킨다. (예: 구생기俱生起 신견, 변견)
=> 출생 후 의식표면에서 <분별>을 행한다.
=> 그런 가운데 다시 <망집번뇌>를 일으킨다. (예: 분별기 신견)
=> 자신을 유지 생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그런 가운데 <탐ㆍ진ㆍ치ㆍ만> 등의 <정서적 의지적인 번뇌>를 일으킨다. [수혹,미사혹]
=> 이후 삶에서 <잘못된 분별>을 일으켜 번뇌를 갖는다. [신견, 계금취견, 변견, 사견, 견취견 등의 미리혹]
=> 그리고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 집착에 바탕해 일상생활에 임한다.
=>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잘못된 소원>을 추구한다.
=>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해 나간다.
=> 이로 인해 욕계 각 주체들 간에 <가해와 피해관계>가 쌓여진다. [업의 장애]
=> 그래서 그런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받아 나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장래 결과 발생 <원인>제거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그 발생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원인>들이 잘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들로 인해 장차 발생할 <생사고통>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사고통>이 <예방>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이미 발생한 고통>에 대한 대처 방안
<생사고통>을 <예방>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원인>을 일단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곧 <생사고통>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미 발생한 생사고통>은 이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생사고통>이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일단 <고통>을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대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이를 평안히 참고 견뎌야 한다.
이 경우 어떤 한 내용에 <집중>한다.
그러면 <의식>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당면한 고통>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또는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그대로 <평안>히 견디는 노력을 한다.
이런 방안도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원래의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추가 노력
<고통>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고 하자.
이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고통>을 제거했다고 하자.
이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다시 회복해 얻어내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고통을 발생시킬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경우 <이미 발생한 나쁜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고통이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좋은 상태>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
즉, 이후 <복덕을 얻는 좋은 상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
이는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손에 <상처>가 나서 흉터가 생겼다.
이를 잘 아물게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의 상태>처럼 되게 한다.
그리고 이후 그 부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과 같다.
♥Table of Contents
▣- <과거>에 쌓여진 <업장>의 추가제거
<과거에 행한 업>으로 <장애>가 쌓여 있을 수 있다. [업장]
그런데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업장>은 장차 <생사고통>을 다시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장차 고통을 발생시킬 원인>을 <중단>한다.
그렇다고 이런 <업의 장애>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사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과거에 쌓아 놓은 업장>까지 <제거>해야 한다.
이런 여러 노력은 마치 <상처의 회복과정>과 같다.
<칼>로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른다고 하자.
그 상태에서 계속 <칼>로 상처를 낸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피>가 또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원인 행위>는 일단 <중단>한다. [원인 중단-예방]
그런 경우 <앞으로 상처가 나는 일>은 예방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곧 <피>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만으로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것만으로 <이미 난 상처>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런 경우 일단 <고통>을 평안히 참아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 [고통에 대한 대처]
한편, <상처>가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별도로 노력한다. [고통을 제거하고 좋음을 얻는 노력]
예를 들어 <상처>를 깨끗이 한다.
그리고 <약>을 복용한다.
그리고 <영양분>을 잘 섭취한다.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을 한다.
한편, 자신이 <과거에 행한 업>의 장애가 쌓여 있다.
이로 인해 <상처>가 자꾸 나게 될 수 있다. [업장 제거]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이를 <욕>했다.
또는 싸웠다.
그래서 <원한관계>가 있다.
그래서 <원수>가 자신을 해치고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행한 업>으로 <장애>가 쌓여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시 상처가 나게 할 <잠재 원인>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그런 <업장>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 <사과>한다.
또는 <좋음>을 베푼다.
그래서 상대와 <화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사현실에서의 <생사고통의 제거>도 이와 같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일단 <생사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단>한다. [원인 중단-예방]
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고통>에 대한 잘 대처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대처]
그래서 <당면한 고통>을 평안히 잘 참고 견딘다.
한편 <원래의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추가 노력을 병행한다. [고통을 제거하고 좋음을 얻는 노력]
그리고 기존에 <이미 쌓아 놓은 업>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런 업장>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병행한다. [업장 제거]
이런 내용들이 <수행>의 <기본 항목>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고통>의 <제거 순서> - <예방>의 중요성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직접 당면해 받는다.
이런 경우 생사고통을 쉽게 극복해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상>을 취하지 않고, 평안히 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대단히 <수행>이 깊은 수행자다.
<안인>을 성취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그리고 더 이상 <범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퇴전위>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상당히 <장구한 기간> 수행을 닦아야 성취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방안을 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생사고통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방을 위한 수행>도 약간의 <고통>이 따른다.
이런 경우 <예방하지 않을 때 맞이할 고통>과 잘 <비교>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고진감래>(苦盡甘來)'나 <'감진고래>(甘盡苦來)'나 마찬가지라고 잘못 여긴다.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하자.
그래도 <예방>이 낫다.
다만, <장래 일>은 단지 <관념>으로만 추리한다.
그리고 <당장 겪는 즐거움>이나 <고통>은 좀 더 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당장 힘든 <예방 노력>을 회피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 <예방 노력>과 <고통>이 훨씬 적다.
예를 들어 산에서 <벼랑>에 떨어지지 않으려 주의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조차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벼랑>에 떨어진다고 하자.
그래서 <다리>나 <허리>가 부러진다.
그런 경우 나머지 생을 <불구>로 지내게 된다.
생사고통 <예방 노력>도 마찬가지다.
<예방에 드는 노력>이 훨씬 적다.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1/80000 보다 적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예방방안>을 잘 취해야 한다.
한편, <원인단계 예방>은 발생과 <역순>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상분별>을 그대로 둔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일단 <고통>에 처하지 않을 방안을 취한다.
그리고 이후 점차 <근본 원인>을 제거해간다.
그래서 <수행>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의 최초 진입 - <인천교>적인 방안
<생사고통>을 예방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생사고통을 겪는 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혹- 업 -고]
<생사고통>의 가장 <근본원인>은 <무명 어리석음>과 <망상분별>과 <집착>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원칙적 예방 방안>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망집>은 그 뿌리가 깊다.
그래서 <당장> 곧바로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편 생사과정에서 <극심한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고 하자.
그러면 <수행> 자체가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망집>을 그대로 둔다.
그런 가운데 <생사과정>에서 <극심한 생사고통>을 일단 벗어나도록 한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일단 <생활상 겪는 고통>부터 하나하나 제거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을 행할 <여건>부터 확보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는 수행>부터 실천한다.
<생사과정>에서 <3악도>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인간>과 <하늘>을 오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세속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 수행>도 쉽지 않다.
이런 수행은 <후생의 생사고통>을 예방한다.
이 경우 먼저 <단멸관>이 제거 돼야 한다.
그래서 <사후 생>까지 고려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잘못된 신견>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일부를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신견]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신>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런 자신>은 <생사과정>에서 끊기게 됨을 보게 된다.
그래서 <생사과정>에서 <사후>에 계속 <자신의 삶>이 이어짐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신견>을 잘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과정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잘못된 견해>의 제거가 쉽지 않다.
결국 처음 수행은 <믿음>에 바탕해 시작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단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다양한 사후 상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가운데 <사후생>이 있거나 없거나 <수행>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을 판단한다.
그리고 <생사과정>에서 <3악도를 벗어나는 수행>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인간과 하늘을 오가는 상태>를 목표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10선법>과 같은 <인천교>적 가르침이 먼저 제시된다.
♥Table of Contents
▣- <인천교>와 <10선법>
각 주체가 <망집>을 바탕으로 <현실>에 임한다.
이런 경우 각 주체가 각기 <집착하는 좋음>이 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생명>, <재산>, <가족>...등에 애착을 갖는다.
한 주체가 <자신 입장>에서 <당장의 좋음>을 추구한다.
그런 경우 이는 <다른 주체의 좋음>을 침해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각 주체들이 <가해>와 <피해>의 관계에 놓인다.
이런 <업의 장애>로 인해 <3악도의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이런 <3악도의 생사고통>을 <예방>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그런 <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내용>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戒계]
이를 통해 <다른 주체>에게 <불쾌>나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각 주체가 일으키는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이 그런 <업>을 행하는 기본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한편 이미 쌓아 놓은 <업의 장애>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업>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업장>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보시>와 <계>와 <10선법>이 기초수행방안으로 경전에서 강조된다. 【1】
그리고 이런 내용이 결국 <3악도의 생사고통>을 벗어나는 <예방> 방안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0선법>의 내용으로 제시된다. [신업3, 어업4, 의업3]
10선법 내용은 다음이다.
1, 살생하지 않는다. [불살생不殺生] - 죽을 생명을 살린다. [방생放生]
2, 도둑질하지 않는다. [불투도不偸盜] - 좋음을 필요한 이에게 베푼다. [보시布施]
3, 간음하지 않는다. [불사음不邪婬] - 바르고 깨끗한 행위를 한다. [청정범행淸淨梵行, 정행淨行]
4,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망어不妄語] - 참된 말을 하라. [진실어眞實語]
5, 이간질하지 않는다. [불양설不兩舌], - 화합시키는 말을 하라. [화합어和合語, 화쟁어和諍語]
6, 욕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악구不惡口] - 부드럽고 순박하며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유순어柔順語, 유연어柔軟語]
7, 실없고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 [불기어不綺語] - 쓸모 있고 이치에 맞는 올바른 말을 한다. [질직어質直語]
8,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불탐욕不貪欲], - 탐욕의 더러움을 관하여 탐욕을 버리고, 선한 서원(誓願)을 갖는다. [부정관不淨觀, 무탐無貪, 서원誓願]
9,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부진에不瞋恚] -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욕됨을 참는다.[인욕忍辱, 무진無瞋, 자비慈悲]
10, 어리석음에 바탕해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다. [불사견不邪見] - 원인과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어리석음을 없애고, 지혜를 갖춘다. [인연관[因緣觀, 무치無癡, 지혜智慧]
<생사고통>을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태어나고자 하는 <하늘>을 <존중>하고 믿는 가운데 이들 <10선법>을 닦아야 한다.
한편, <생사의 묶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수행자는 일단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하늘>과 <인간>을 오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0선법>은 수행에서 기초적으로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이후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하는 보살 <수행자>의 경우도 사정이 같다.
<수행자 자신>부터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생을 <생사묶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이후 수행은 <이런 기초 수행>을 <성취한 바탕>에서 행해 나가야 한다.
【주석】---
【1】 기초적으로 보시布施, 지계持戒, 생천공덕生天功德, 애욕미환愛欲味患, 번뇌煩惱, 청정淸淨, 출요원리出要遠離, 제청정분諸淸淨分 등을 설한다.
이들 내용은 『잡아함경』 제4권 제42권 『별역잡아함경』 제4권, 제15권 등에 같은 내용이 보인다.
또한 『중아함경』 제6권 제9권 11권 32권 41권 등에 같은 표현이 보인다.
그리고 『불설장아함경』 제1권, 2권 3권 13권 15권 등에 같은 표현이 보인다.
{ K0650V18P0739c20L; 示教照喜如佛世尊次第說法說布 『잡아함경』(雜阿含經), 제4권 92. 교만경(憍慢經), 류송 구나발타라역(劉宋 求那跋陀羅譯), K0650, T0099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예비단계
<10선법>을 닦아 일단 극심한 생사고통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렇다고 <생사 묶임>에서 풀려나 벗어난 것은 아니다.
생사과정에서 <3악도의 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우선 <하늘>과 <인간>을 오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고통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생사고통의 과정>을 다시 깊이 관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임시적인 방안>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마치 <한 생> 안에서 <고통>을 잠시 해결하고 벗어나는 방안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병>에 걸려 <죽음>에 직면해 있다.
이 때 그는 <당장의 병>만 치유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래서 <병>을 치유한다.
그렇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사과정에서 <하늘에 태어남>도 이와 같다.
<하늘세계>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장구하다.
그러나 이는 무량겁에 걸친 생사고통의 <근본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한다.
한 주체가 <하늘세계>에 태어난다.
그런데 이런 사실 자체가 다음을 의미한다.
하늘세계도 <영원불변>하지 않다.
따라서 역시 <무상>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후 다시 <생사고통>을 반복해 받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생사고통>에 다시 묶인다.
욕계 하늘과 색계 무색계는 일단 3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생사 윤회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여전히 목숨이 다하고 겁(劫)이 다하는 재앙이 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욕계의 3악도에 처해 고통을 겪게 된다.【1】
따라서 <생사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생사 묶임>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교>와 별도로 <불교 수행방안>이 필요하다.
<인천교>는 <하늘>에 태어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불교는 근본적으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해탈, 열반]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처음에 다음 <예비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예비단계>는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불교의 가르침 4제법>에 들어서기 이전 단계다.
그래서 이를 <외범>이라고 칭한다. [외범]
이는 먼저 <고통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대치해 해결한다. [5정심관]
한편, <무상ㆍ고ㆍ무아ㆍ부정>을 관해 <집착>을 제거한다. [별상념주, 총상념주]
그래서 <망집 번뇌>와 <집착>을 약화시킨다.
이는 본격적으로 4제법에 들어가기 이전의 <예비단계>다. [외범, 3현(5정심관+별상념주+총상념주), 자량위]
또 하나는 <불교 가르침 안>에서의 예비 <단계>다.
이는 <불교의 4제법>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시작하는 단계다. [내범, 4선근위, (난ㆍ정ㆍ인ㆍ세제일법), 가행위]
이들 <내범>과 <외범>을 모두 합쳐 <7방편위>(方便位)라고 한다.
이들은 <범부>의 지위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단계다.
이는 일단 <하늘에 태어남>을 목표로 하는 <인천교>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생사 묶임>을 벗어나는 <수행의 기초>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단계>다.
그러나 <본격적 수행>이 성취되지 않은 점에서는 <낮은 단계>다.
즉, <성인의 단계>로 보지는 않는다.
이는 <현인의 단계>다.[범부위]
<일반 입장>에서는 처음 이런 형태로 수행에 들어서게 된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기초 내용>의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주석】---
【1】 { K0797V19P0913a06L; 何謂諸天苦從第一天上至二... 『오고장구경』(五苦章句經), 동진 축담무란역(東晋 竺曇無蘭譯), K0797, T0741 }
【주석끝】---
▼▼▼-------------------------------------------
● 다음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58~72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3장_부처님의_가르침_(0).txt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001.txt
-------------------------------------------
♥Table of Contents
▣- 외범으로서 3현
아직 <불교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기초적 수행>은 행할 수 있다. [외범(外凡), 자량위(資糧位)]
즉, <생사고통의 묶임>을 벗어나는 <기초적 수행>을 닦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셋>으로 나뉜다. [3현(三賢)]
첫째 <5정심관>(五停心觀)을 행한다.
둘째 <별상념처>(別想念處)를 닦는다. [4념처]
셋째 <총상념처>(總想念處)를 닦는다.
♥Table of Contents
▣- 5정심관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탐ㆍ진ㆍ치>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업>을 행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생사>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원칙적으로 <망집번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번뇌>는 <생사고통>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생사고통의 근본 원인>이 된다.
즉, <업>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게 한다.
따라서 이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망집번뇌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일단 <번뇌>가 나타날 때마다 그 때 그 때 이를 <대치>해 약화시킨다.
즉, 문제 상황마다 서로 다른 <대치 방안>을 사용한다.
고통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은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의 <번뇌>다.
그 외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는 자세가 문제된다.
한편 집중하지 않고 들떠 <산란함>도 문제된다.
또는 반대로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음> 상태도 문제된다.
한편 과거에 쌓은 <업장>도 장애 원인이 된다.
이런 각 경우 각기 다음 <대치 방안>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번뇌>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결국 <5 정심관> 내용이 된다. [5정심관五停心觀, 5도관문五度觀門]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탐욕에 대한 대치 방안
<탐욕심>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대상이 <깨끗하지 못함>을 생각한다.
이를 통해 <탐욕>을 약화시킨다. [부정관不淨觀 aśubhā-smṛti]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 <생명>에 강한 <집착>을 갖는다.
더 나아가 <이성>에 강한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외부 상태>에 집착한다.
넓고 길고 깊게 관찰할 때 이런 자세는 <악하고 더러운 결과>를 일으킨다.
때문에 <탐욕>을 잘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것에 들어 있는 <나쁨>을 찾아낸다.
또 다른 <더 좋은 내용>들이 없는 측면을 관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애착을 갖는다고 하자.
이런 경우 <몸>에 있는 <더러운 면>을 찾아낸다.
또는 죽어서 신체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과정>을 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체의 <더러움>을 관한다.
이를 통해 <탐욕의 마음>을 중화시킨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집착>을 떨쳐 낸다.
이런 수행법이 <부정관>이다.
<부정관>은 <탐욕>과 <집착>에 대치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독>을 중화시켜 치유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당장> <초점>을 맞추는 좋음이 있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소원>을 일으킨다.
이런 소원을 추구하면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쓸모없는 소원>은 남김없이 제거한다.
그리고 대신 <맑고 깨끗한 서원>을 일으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한다.
즉,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든 생명>이 좋게 되는 상태를 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오래 오래> 좋은 상태를 원해야 한다.
또 <이 측면>도 좋고 <저 측면>도 좋고 <두루두루> 좋은 상태를 원해야 한다.
- 분노에 대한 대치 방안
한편 <분노>가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우선 어떤 <상태>에 대해 <분노>를 일으킬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그에 <더 다른 나쁨>이 없음을 생각한다.
한편 <다른 좋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한편 어떤 <상대>에 대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와 <입장>을 바꿔 바라본다. [역지사지]
그리고 상대가 자신과 입장이 <다를 바 없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 <공감>할 바를 찾아본다.
또 상대와 조화롭게 힘을 합해 얻어낼 <공동이익>을 찾아본다. [요철결합]
반대로 상대를 분노로 대할 때 받을 <손해나 위험>을 찾아본다. [오월동주]
한편, 무량겁에 걸쳐 모든 생명이 자신과 <부모 자식 관계>에 있었음을 관한다. [무량겁 생사윤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한편 모든 중생이 장차 모두 <부처님이 될 위대한 존재>임을 관한다. [일체중생성불]
따라서 이에 바탕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한편, 상대에 <가엾이 여길 만한 점>을 생각한다. [연민]
대부분 <망집>과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인다.
따라서 이런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자비]
한편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를 대하듯 상대를 관한다.
또는 현명한 부모가 <철부지 아이>를 대하듯 상대를 관한다.
또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상대를 관한다.
한편 일체 상을 취하지 않고, 분별을 떠난다. [무상삼매]
그래서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임해도 이를 <평안>히 <참고 견딘다>. [인욕,안인]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를 <용서>한다.
그리고 널리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자비관慈悲觀 maitrīsmṛti]
그런 가운데 상대를 포함해 온 생명을 <최상의 상태로 이끌려는 마음>을 갖는다.
- <어리석음>에 대한 대치 방안
한편 <어리석음>에 싸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물이 변화하는 <과정>과 <관계>를 반복하여 살핀다.
이로써 <지혜>를 얻어낸다. [연기관緣起觀 인연관, idaṃpratyayatā-pratītyasamutpāda-smṛti]
- <산란함>과 <가라앉음>에 대한 대치 방안
한편, 번뇌들로 마음이 들떠 <산란>할 경우가 있다. [도거掉擧]
또는 마음이 어둡고 <혼미>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침울>하여 무겁고 <둔하게 가라앉은 경우>도 있다. [혼침惛沈]
이런 경우 자신의 <들숨> <날숨>을 세며 마음을 <집중>한다.
그래서 마음을 적정하게 <안정>시킨다. [수식관數息觀]
- <망상분별>로 인한 <집착>(망집)에 대한 대치방안
한편, 자신과 세상에 대해 <망상분별>을 일으키고, <집착>을 강하게 갖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번뇌>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각 계[영역]을 잘 관찰한다.
즉, 3계 6도의 3계(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18계 등의 정체와 상호 관계를 잘 관한다.
18계는 다음 내용이다.
감관 :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의-
얻어진 내용 : 색ㆍ성ㆍ향ㆍ미ㆍ촉ㆍ법-
얻는 작용 : 안식ㆍ이식ㆍ비식ㆍ설식ㆍ신식ㆍ의식계
이런 내용 들이다.
이를 통해 이들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화합의 결과>임을 이해한다.
즉 이들 <현실 내용>은 <각 영역>[계界]에서 그처럼 얻어진다.
그러나 이는 <다른 영역>[계界]에서는 본래 얻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영역>[界]의 내용들과 화합을 통해 일으켜 얻어지는 것뿐이다.
즉, 이들 일체는 <지ㆍ수ㆍ화ㆍ풍ㆍ공ㆍ식>(地水火風空識)과 같은 요소가 화합하여 나타난다. [六界육계]
그래서 이들은 마치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리고 이들에는 본래 <진짜>라고 할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無我, 무자성無自性)
이는 비유하면 <불>이 <나무>를 태워 <재>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또는 <수소>와 <산소>가 화합해 <물>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물>은 그처럼 수소와 산소가 <화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에서는 물의 <모습>과 <성품>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침대>가 놓인 <현실>에서는 <꿈>에서 본 <모습>과 <성품>을 얻을 수 없다.
<각 영역>간의 관계가 이와 같다.
그래서 이들 <각 영역>[계界]의 이런 <관계>와 <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들 <각 영역>[계界]의 현실 내용은 본래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들은 <집착>을 가질만한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래서 <집착>을 끊어낸다. [계분결관界分別觀 dhātu-prabheda-smṛti ]
- <두려움>과 <불안> 등 <업장>에 대한 대치방안
한편. 공연히 <두려움>과 <불안>, 걱정을 갖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이미 쌓은 <업장>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당장 <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부처님>을 <본받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다. [념불관念佛觀]
이들은 <각 문제 상황>에 대응해, <각 방편>을 대치해 사용한다.
<5정심관>의 5항목을 들 경우 <계분별관>을 넣기도 하고, 대신 <념불관>을 넣기도 하다.
- <별상념주> <총상념주>
<망집 번뇌>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세상>과 <자신>의 <정체>와 <성격>에 대해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망상 분별>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다만, <망집의 뿌리>는 대단히 깊다.
그래서 처음 <기초>적으로 다음 내용을 관한다.
먼저 관할 내용을 다음 4개로 나눈다.
자신의 <몸>[신身]
<느낌>[수受],
<마음>[심心],
그리고 <나머지 외부 현상>[법法]이다. [4념주관四念住觀]
이들에 대해 <살필 수 있는 내용>은 <무량>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은 <생사묶임>을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함이 목표다.
그래서 <집착을 제거하게 하는 내용>을 <초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 각기 다음처럼 관한다.
즉, 먼저 <몸>이 <깨끗하지 못함>을 관한다. [관신부정觀身不淨]
그리고 <느낌>이 <고통을 가져다 줌>을 관한다. [관수시고觀受是苦]
그리고 <마음>이 변화하며 <영원하지 않음>을 관한다. [관심무상觀心無常]
그리고 <다른 일체 외부현상>[法]이 <참된 진짜>가 아니며 <실체>가 없음을 관한다. [관법무아觀法無我]
이것이 <별상념주>다.
한편, 다시 이들 <전체>에 대해 <부정>, <고>, <무상>, <무아>를 함께 관한다.
즉, 처음 <별상념주>로 <몸>이 <부정>함을 관했다.
이후 이를 통해 몸과 느낌, 마음, 일반현상 <일체>가 모두 <부정>함을 관한다.
또 <고통>, <무상>, <무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이들 일체가 모두 <고통>이 됨을 관한다.
또 이들 일체가 모두 변화하고 <무상함>을 관한다.
또 이들 일체가 참된 진짜가 아니며 <실체>가 없음을 관한다.
결국 이들 <신ㆍ수ㆍ심ㆍ법> 일체가 <부정, 고, 무상, 무아>임을 관한다. [부정不淨, 고苦, 무상無常, 무아無我]
이를 <총상념주>라고 칭한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에 대해 갖는 <집착>을 약화시킬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관신부정>(觀身不淨)
현실에서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평소 이에 대해 망집을 갖고 <집착>한다.
즉 <몸>이 <영원>하다.
몸이 <즐거움>을 준다.
이 몸이 <진짜 참된 자신>이다.
이 몸이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여긴다. [상락아정常樂我淨]
그런 <집착>을 갖고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기초로 일정한 <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바>를 함부로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각 주체 간에 <가해 피해관계>가 <중첩>해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업>으로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처음 이런 <잘못된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망집의 뿌리>는 대단히 깊다.
그래서 우선 이런 <망집>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선 이런 <몸>이 사실은 깨끗하지 못함을 관한다.
몸 안에는 <피>, <고름>과 <소대변>이 차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 썩어 없어진다.
그래서 <사체>가 썩어 없어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관한다.
이를 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방안>이 있다.[九想9상]
시신이 부풀어 팽창한다는 생각 [방창상胮脹想 vyādhmātaka-saṃjnā]ㆍ
고름이 곪아 터진다는 생각 [농란상膿爛想 vipūyaka-saṃjnā]ㆍ
시신의 색이 붉으죽죽하게 변한다는 생각 [이적상異赤想 혈도상血塗想 vilohitaka-saṃjnā]ㆍ
시신의 색이 푸르게 어혈진다는 생각 [청어상靑瘀想 vinīlaka-saṃjnā]ㆍ
새나 짐승이 시신을 파먹는다는 생각 [탁담상啄噉想 vipaḍumaka-saṃjnā]ㆍ
새나 짐승에게 먹혀 시신이 분열된다는 생각 [이산상離散想 vikṣiptaka-saṃjnā]ㆍ
육신이 다해 백골만 남게 된다는 생각 [해골상骸骨想 asthi-saṃjmā]ㆍ
백골이 불에 태워진다는 생각 [분소상焚燒想 vidagdhaka-saṃjnā]ㆍ
시신이 부패하여 없어진다는 생각 [멸괴상滅壞想 파괴상破壞想 괴란상壞爛想 vikhāditaka-samjnā)
등이다. ( 『대반야바라밀다경』 제2분 환희품 제2)
* 胮배불뚝할방, 脹부풀창 膿고름 농 爛문드러질 란, 瘀어혈질 어 啄쪼을 탁 噉먹을 담 骸백골 해 焚불사를 분
9상九想-방,농,이,청,탁,이,해,분,멸(胮膿異靑啄 離骸焚滅)
그래서 <몸>은 애착을 갖고 대할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현실 일체>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집착>을 심하게 가져 문제가 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런 집착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에 <숨겨진 나쁜 점>을 찾아내 관한다.
또는 <인과>상 결합된 과거나 미래의 나쁜 점을 찾아내 관한다.
또는 그것을 더럽고 좋지 않게 보고 <싫어할 입장>이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를 대해 관할 수 있다.
또는 <더 좋은 점>이 없는 측면을 관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좋은 점>들이 없는 측면을 관할 수도 있다.
또는 <대신 있을 좋은 점>이 없는 측면을 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나쁜 측면>을 관한다.
그래서 <집착>을 제거한다.
앞에 9상을 나열했다.
이에 다시 다음 생각을 더하면 10상이라고도 한다.
즉, 온갖 세간은 모두 <즐겁지 못하다>는 생각[일체세간불가락상一切世間不可樂想]을 더하기도 한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초분 보살품 제12지2)
다만 처음 <부정관>을 닦는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몸>을 관하는 것이 쉽다.
이후 <일체>에 확대해 적용하여 관한다.
그래서 <별상념주>와 <총상념주>의 구분이 있게 된다. [관신부정觀身不淨]
<나머지 항목>도 마찬가지다.
♥Table of Contents
▣- <관수시고>(觀受是苦)
<느낌>에는 즐겁고 <좋은 느낌>이 있다. [낙수樂受]
또 고통스럽고 <나쁜 느낌>이 있다. [고수苦受]
그리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모호한 느낌>도 있다. [사수捨受,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
또 심지어 <일부>는 좋고 <일부>는 나쁜 느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느낌>이 <고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통이 아닌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통>이 문제다.
그리고 <고통>의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대한다고 하자.
그래서, 이들이 <끝내 고통과 관련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경우 <앞>과 달리 판단한다.
그렇게 살펴야 <생사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수행을 통해 끝내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는 입장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생사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이 모든 경우가 <고통과 관련된 측면>을 살피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모든 경우가 다 <고통>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 각 주체는 <좋음>에 집착한다.
그런 <집착>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한다.
또 한편, <나쁨>을 받으면 <분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상대를 <보복>하고 해치게 된다.
그리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경우>는 다시 <무관심>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통>을 <되돌려 받는 상태>에 처한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들 일체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좋음>에 <집착>한다고 하자.
그러나 좋음은 영원하지 않아 끝내 사라진다.
이런 경우 <좋음에 집착한 만큼> 그에 비례해 <고통>을 받게 된다. [괴고壞苦]
한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경우>라고 하자.
그 역시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
그래서 결국 <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행고行苦]
그리고 당장 <고통스런 나쁨>이 있다고 하자.
이는 당장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고고苦苦]
이처럼 각 경우가 모두 <고통>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먼저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에 대한 <집착>을 제거한다.
일체가 모두 <고통>에 귀결되는 사정을 관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느낌>을 놓고 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후 <현실 일체>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
그래서 <별상념주>와 <총상념주>의 구분이 있다. [관수시고觀受是苦]
♥Table of Contents
▣- <관심무상>(觀心無常)
현실 각 내용은 <변화>한다.
그래서 끝내 <영원>하지 않다.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에 대해 갖는 <집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일체가 <무상함>을 관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마음>을 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후 <현실일체>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
그래서 <별상념주>와 <총상념주>의 구분이 있다. [관심무상觀心無常]
♥Table of Contents
▣- <관법무아>(觀法無我)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각 부분>은 <자신>이나 또는 <영희>, <고양이>, <꽃>, <바위> 등으로 여긴다.
즉 <자신>, <자신과 동류의 인간>, <다른 동물>, <식물>, <무생물> 등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대하는가에 따라 매 경우 달라진다.
<각 감관별>로 얻는 <내용>도 다르다.
예를 들어 <눈>을 뜨고 대하는 내용과 <코>로 대하는 내용이 다르다. [감관]
또 아침에 대할 <때>와 밤에 대할 <때>도 다르다. [시기]
<정지해서 대할 때>와 <움직이며 대할 때>도 다르다. [상황]
<가까이 대할 때>와 <멀리 대할 때>도 다르다. [거리]
그렇지만 한편, <이 각각>은 <일정한 모습>과 <성품>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여전히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다수>가 일정 <시기> <상황> 일정 <조건>에서 <일정 관계>로 <엇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얻게 된다 .
그래서 이는 <참된 진짜>로서 <뼈대가 되는 실체>가 이 안에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현실 각 내용에 이런 <참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이들 내용은 <꿈과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실답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집착>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묶이게 된다.
그러나 이를 깊게 관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즉, 현실 일체는 <변화>하고 무상하다.
그런데 이런 <참된 진짜>로서 <영원하고 고정된 뼈대>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 내용>도 얻어질 도리가 없다.
따라서 그런 <실체>는 있을 수 없다.
그래도 <진짜로서의 참된 실체>가 따로 있다고 하자.
그렇다해도 현실에서는 이런 <실체>를 별도로 살필 <실익>이 없게 된다.
현실 일체는 <변화>하고 무상하다.
또한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영원불변한 실체>와 관련 맺을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즉, <변화하는 것>은 <영원하고 고정된 것>이 될 도리가 없다.
만일 <변화>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그 실체> 역시 <변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실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변화하는 현실 입장>에서는 이런 <실체>와 관련 맺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이런 <실체를 별도로 살필 실익>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먼저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잘 관해야 한다.
즉, <꿈>과 달리,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뼈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 대해 그것이 <실다운 것>이라고 잘못 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일체>가 이러함을 관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처음에 <일반적인 외부현상>을 놓고 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후 <현실일체>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일체>가 모두 참된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일체>에 <참된 실체>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별상념주>와 <총상념주>의 구분이 있다. [관법무아觀法無我]
---
<별상념주> <총상념주>등을 잘 닦는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 일체>가 부정(不淨)ㆍ고(苦)ㆍ무상(無常)ㆍ무아(無我)임을 잘 관하게 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사의 묶임>에서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후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예비 단계>의 수행이 된다.
이들 내용은 <4념주>와도 관련된다.
<4념주>는 <불교 정식 수행항목>이다.
또 <무상ㆍ고ㆍ무아ㆍ열반적정ㆍ공>은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도 된다. [법인설]
이들은 <이런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이들은 <기초적 내용>이다.
따라서 <상식적 입장>에서도 조금만 깊게 관찰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불교 밖>의 <일반적인 수행 예비단계>로 본다. [외범]
한편 이는 <망집 번뇌>를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범부 단계>다.
다만 이런 <기본 수행>을 잘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집착>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일반 상태에서는 가장 높은 <현인>의 단계로 평가한다.
이런 상태에서 좀 더 <불교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기초적으로 <4제법>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 <불교내> <수행 예비 단계>가 된다. [내범]
이를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불교내> 수행 <예비>단계 (난ㆍ정ㆍ인ㆍ세제일 4선근위)
<불교의 수행>에 들어선다고 하자.
그런 경우 기초적으로 <4제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다음의 4 부분으로 되어 있다.
- <고통>의 현실문제 [고제]
- 고통의 <발생 원인> [고집제]
- 고통이 제거된 <수행목표 상태> [고멸제]
- 고통을 제거시키는 <수행방안> [고멸도제]
즉, 고제- 고집제 - 고멸제 - 고멸도제다.
생사현실에서 <고통의 제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
그런 경우 <병의 정체>ㆍ<병의 발생원인>ㆍ<병이 치유된 목표 상태>ㆍ<병의 치유방안>을 살펴야 한다.
<생사고통의 해결>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4제법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4제법>을 관하고 닦는 것부터 <불교내> 수행 단계가 된다. [내범]
<4제법을 처음 닦는 예비 단계>로 <4선근위>(四善根位)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ㆍ집ㆍ멸ㆍ도 4제의 <16행상>을 관하고 닦는다.
즉, 이는 모두 <4제법>을 관하고 닦는 수행이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를 <난위>(煗位)ㆍ<정위>(頂位)ㆍ<인위>(忍位)ㆍ<세제일위>(世第一位)로 구분한다.
4선근위에서는 이처럼 4제법을 관한다.
그리고 4제법을 닦아 나간다.
4제법은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이다.
이는 곧 <고통의 정체>와 <그 발생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된다.
그리고 <고통이 제거된 목표상태>과 <그 성취방안>을 이해하고 닦는다.
처음 <고제>를 관하는 과정에서부터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닦게 된다.
이는 <제행무상>ㆍ<일체개고>ㆍ<제법무아>ㆍ<열반적정>ㆍ<일체개공>과 같은 기본 가르침과 관련된다. [법인설]
이들은 <일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진리다.
그리고 이들 내용이 <불교의 기본 핵심>이 된다.
따라서 이는 <불교내 예비 수행단계>에 포함된다. [내범]
그리고 4선근위는 <불교 수행의 기초적 예비단계>다. [가행위加行位]
이는 앞 단계 3현을 <불교 밖 예비 수행단계>로 보는 것과 구분된다. [외범]
즉, <5정심관>(五停心觀) <별상념처>(別想念處) <총상념처>(總想念處)는 불교 밖 예비 수행단계로 본다.
다만, 4선근 단계는 아직 <망집 번뇌>를 본격적으로 제거한 상태는 아니다.
4 선근은 일단 3악도 <생사고통>에서 벗어남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이후 본격 수행에서는 <생사묶임>에서 벗어남을 목표로 수행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은 <범부의 상태>다.
그러나 범부 입장에서는 <최상위>다.
4선근위는 <생사 고통>과 <생사현실의 묶임>에 벗어남에 다음 차이가 있다.
이들 <4선근>은 <수행 정도와 깊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4선근위 안의 차별도 <4제법의 이해>와 <수행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난위>(煗位)의 상태는 3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열반을 끝내 증득할 정도>에 도달한 상태다.
4제법을 관해서 이런 정도에 이른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난위라고 칭한다.
한편, <정위>(頂位)는 3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끝내 선근은 잃지 않는 정도>에 도달한 상태다.
한편, <인위>(忍位)는 이제 <더 이상 3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 정도>에 이른 상태다.
한편, <세제일위>(世第一位)는 번뇌를 가진 <범부 상태에서는 최상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
현인의 최상위에서 이후 조금만 수행을 더 닦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성자의 수행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결국 이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수행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4제 16행상>부터 살피기로 한다.【1】【2】
【주석】---
【1】 { K0955V27P0621c23L; 長故能具觀察四聖諦境及能具修十六行相...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23권, 6.분별현성품②,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2】 { K0955V27P0647a16L; ... 十六行相實事有幾何....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26권, 7.분별지품(分別智品) ①,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고제(苦諦)의 4행상 [비상非常ㆍ고苦ㆍ공空ㆍ비아非我]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 상태가 수행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이런 고통은 다음 바탕에서 나타난다.
즉 현실은 비상(非常)ㆍ고(苦)ㆍ공(空)ㆍ비아(非我)의 상태다.
현실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각 주체가 <고통을 겪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사정이 고통의 현상이 나타나는 <바탕>이 된다.
한편 각 주체가 <그런 사정>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집착>을 갖는다.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들 각 내용>이 <생사고통과 관련되는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비상非常 anitya] = 고
현실 일체는 <인연>에 의존해 <생멸 변화>한다.
따라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즉, <무상>하다. [비상非常 anitya]
따라서 <나쁜 상태>는 나쁜 상태라서, <고통>받는다. [고고]
또 아무리 <좋은 상태>라고 해도 그것이 <소멸>되기에 <고통>받게 된다. [괴고]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상태>는 그것이 변화하기에 <고통>을 만나게 된다. [행고]
<그런 사정>으로 각 주체는 <고통>에 노출되게 된다.
물론 이는 <이와 반대로> 관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통>이 <생사현실>에서 문제된다.
따라서 고통을 <초점>으로 하여 현실을 이처럼 살피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무상함>이 <고통>을 나타나게 하는 측면을 살핀다.
한편 이처럼 <현실>은 <무상>하다.
그런데도 <현실이 영원하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현실에 <집착>을 갖는다.
그래서 <업>을 행한다.
그런 경우 그에 기초해 그 주체는 <고통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 [고苦 duḥkha] => 고
각 주체는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기초해 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현실 내용에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의 상태에 처한다.
따라서 한 주체가 <망집>을 일으켜 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주체가 대하는 현실 일체>는 <고통>에 귀결된다. [고苦 duḥkha]
그럼에도 각 주체는 현실에서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 내용이 <좋음>을 가져다 주리라 여긴다.
그리고 <소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래서 반복해 <생사 고통>에 노출되게 된다.
- [공空 śūnya] => 고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이런 생사 고통의 <본 바탕>은 <공>하다.
그리고 <본 바탕 실재>에서는 본래 이런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모두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래 <생사 묶임>을 벗어난 <니르바나>의 상태다. [본래자성청정열반]
따라서 다음이 문제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본 바탕 실재>는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의 생사고통>과 <실상>은 무슨 관계인가.
이 관계를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생멸>과 <생사>를 겪는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의 해결>이 문제된다.
그래서 처음 이런 <생사현실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가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본 바탕은 각 주체와 <관계>되지 않고도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이를 본바탕 <실재>라고 칭하기로 하자.
그런데 각 주체는 그가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본바탕이 되는 실재>는 각 주체가 끝내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는 일체의 <분별>과 <언설 표현>을 떠난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일체 <언설>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정으로 <방편상> <공>이란 표현을 빌려 이를 표현하게 된다. [공空 śūnya]
여기서 <공>은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의미와 내용을 갖지 않는 표현>이다.
마치 내용이 빈 <허공>과 비슷하다. [虛空허공 ākāśa]
그래서 <내용을 얻지 못하는 실재 상태>를 공(空 śūnya)이라고 <방편상> 표현한다.
그래서 <공이란 표현> 역시 <공>하다.
한편 현실에서는 <생멸>과 <생사>를 문제삼는다.
그러나 본 바탕의 <공한 실재 영역>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실재영역에서는 <무엇>이 <다른 무엇>을 <안다는 일>도 없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이런 <생사>와 <생멸>도 모두 떠난다.
<생사고통>도 당연히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는 본래 <생사 고통>을 떠난 상태다.
그래서 이는 본래 <청정한 니르바나>라고 칭한다. [본래자성청정열반]
그리고 <이런 상태>는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상태>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생명은 이 상태를 <떠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는 <모든 생명>에게 <이미 갖춰진 상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 주체는 대부분 <망집>이 덮혀 있다.
그래서 그 <망집>을 제거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래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기본적 수행 목표>로 제시한다.
그런데 공한 실재에서 반드시 <생사현실>과 <생사고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생사현실은 우선 각 주체가 <관계>를 맺을 때 화합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마치 <눈>을 떠야 <세상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사정이 같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각 주체가 <화합해 얻는 마음내용>이다.
그리고 이 <생사현실> 안에 반드시 <생사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런 현실 상태에서 <망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자.
또 망집이 있더라도 이를 남김없이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에 묶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자.
그러면 각 주체는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겪는 문제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바로 차별없이 공한 <본 바탕 실재>를 <기초>로 나타난 것이 된다.
따라서 <생사고통>과 <실재의 공함>은 이런 측면으로 우선 <관련>된다.
- 한편, 한 주체가 겪는 <생사고통>은 다음 과정을 통해 겪게 된다.
우선 각 주체는 <공한 본 바탕과 생사 현실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정으로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만일 생사현실 안에서 <본 바탕의 정체>를 잘 관한다고 하자.
그래서 이런 <본바탕 실재>와 <생사현실>을 잘 대조 비교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은 <본 바탕 실재>에 비추어 볼 때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즉, 현실은 마치 <침대>에 누어 꾸는 <바다꿈>과 성격이 같음을 이해한다.
<본 바탕 실재>는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실재>를 기초로 얻게 되는 <생사현실>은 매순간 생생하고 명료하다.
따라서 <실재>와 <현실>의 관계는 마치 <꿈>의 관계와 같다.
즉 누어서 자는 침대가 놓인 <현실>과 꿈에서 꾸는 <바다모습>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통해 <생사현실> 안에서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집착에 바탕해 행하던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으킨 <망상분별>도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각 주체는 <근본 무명 어리석음>을 기초로 임한다.
그리고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자신>으로 잘못 여기고 취한다.
그리고 본 <바탕>에서도 <이런 내용>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즉 <실재가 공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 내용을 <꿈>과 달리 실답다고 여긴다.
그리고 <집착>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기초해 <업>을 행해 나간다.
그래서 <생사 고통>을 겪어 나간다.
또 <이런 바탕>에서 <생사>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차별없이 공한 실상>에 대한 <어리석음>이 <생사고통>과 <관련>된다.
- [비아非我 anātman] => 고
<현실 일체>에는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비아非我 anātman]
그래서 반대로 <현실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그런 사정으로 현실에 <고통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한편 각 주체는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각 주체는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따라서 <생사>에 묶인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이처럼 <비아>(非我)와 <고통의 현실>은 관련된다.
우선 <실체>가 왜 문제되는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꿈>은 실답지 않다.
그런데 <현실>이 <꿈>과 성격이 같은가가 문제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먼저 <꿈>과 달리, 실답다고 할 <실체>를 <관념>으로 구상한다.
이 상태는 단지 <관념>만으로 그런 개념을 구상한 것이다.
<토끼>와 <뿔>이란 관념을 합쳐 <토끼뿔>이라고 관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관념>이 있다고 반드시 그런 내용이 <다른 영역>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런 실체>가 현실의 다른 영역에 정말 존재하는가를 문제삼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은 <꿈>과 달리, <실다운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그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은 <꿈>과 성격이 같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은 <실답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처럼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참된 <실체>가 현실 영역에 정말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변화하는 <현실 일체>는 현실에 하나도 나타날 도리가 없다.
<실체>가 꿈과 달리, 실답게 되기 위해 관념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과 필연적으로 <상호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실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반대로 다음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실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 바로 사정이 그렇기에, 현실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 그런 사정으로 현실의 <생사 고통>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실체가 없음>은 <생사고통>과 이런 측면으로 서로 관련된다. [무아, 무자성]
한편, 각 주체는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즉 각 주체는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경우 <현실 각 내용>에 참된 뼈대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참된 실체>가 있어야만 <현실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현실 내용>은 그런 <참된 실체>를 <기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고집한다.
그런 경우 또 이런 잘못된 분별을 기초로 <현실 내용>을 <실답다>고 여긴다.
그리고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각 주체는 현실 일체에서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따라서 이처럼 <실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생사고통>과 관련된다.
- 결국 <생사현실의 고통>을 관찰하기 위해서 <현실의 기본 사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통>과 관련해 <비상>(非常)ㆍ<고>(苦)ㆍ<공>(空)ㆍ<비아>(非我)를 관한다.
우선 <이들 내용>은 <생사현실>의 <정체>와 관련된다.
<현실의 본 정체>가 이와 같다.
그런 사정으로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겪는 현상>이 있게 된다.
한편 각 주체는 또한 <그런 사정>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잘못된 분별>을 행한다.
예를 들어 <상>(常), <락>(樂), <생멸>, <아>(我) 등으로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 내용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업>을 행한다.
즉 그런 사정으로 자신이 <업>을 행할 수 밖에 없다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주체가 <업의 장애>를 쌓게 된다.
즉 서로 <가해>와 <피해>관계가 중첩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받아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측면은 모두 그 주체가 겪는 <현실의 생사고통>과 직결된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진리>[고제] 부분에서 이런 측면을 잘 관한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 문제 상황>을 직시한다.
♥Table of Contents
▣- 고집제(苦集諦)의 4행상 [인因ㆍ집集ㆍ생生ㆍ연緣]
<고통>은 일정한 <인과>에 의해 나타난다.
즉, 다음과 같다.
각 주체가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망집 번뇌>와 <업>(業)이 고통을 낳는 씨앗[種子]에 해당한다.
즉, 고통을 낳는 <직접 원인>이 된다. [인因 hetu]
그래서 이로 인해 고통의 결과들이 <모여져> 나타난다.[집集 samudaya]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의 존재가 이어 상속되어 <나타난다>.[생生 prabhava]
그리고 이들이 고통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조건들>(연)이 된다. [연緣 pratyaya]
그래서 <고통의 발생>과 관련해 이런 측면을 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과>와 관련한 잘못된 견해를 다스린다.
즉, <무인론>, <단일원인론>, 실체론에 바탕한 <전변론>, <적취론> 등이 그것이다.
♥Table of Contents
▣- 고멸제(苦滅諦)의 4행상 [멸滅ㆍ정靜ㆍ묘妙ㆍ리離]
수행의 목표 상태는 <고통이 멸한 상태>다.
즉, <일체 고통>과 <번뇌 망집>이 소멸된 상태가 목표다.
이를 <해탈>, <니르바나>[열반]이라고 표현한다.
<해탈> <열반>의 상태는 다음 특징을 갖는다.
모든 <현실 요소>[5온]로부터 얽매임이 다해서 사라진 상태다. [멸滅 nirodha]
그리고 <탐ㆍ진ㆍ치> 번뇌의 시끄러움이 그치고 적정한 상태다. [정靜 śānta]
그리고 3계를 벗어나 <온갖 근심>이 없어진 묘한 상태다. [묘妙 Pranīta]
그리고 온갖 생사고통과 <재액>(災厄)을 멀리 벗어나 여읜 상태다. [리離 niḥsaraṇa]
그래서 해탈과 니르바나를 이처럼 관한다.
이로써 해탈과 관련한 잘못된 견해를 다스린다.
즉 <묶임>에서 벗어난 해탈 상태가 없다고 잘못 여기는 경우가 있다.
또는 해탈이 <고통>이라고 잘못 여기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정려>의 즐거움 등만 묘하다고 잘못 여기는 경우가 있다.
또는 해탈상태가 생사현실로 <다시 물러난다>고 잘못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해탈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제거한다.
♥Table of Contents
▣- 도제(苦滅道諦)의 4행상 [도道ㆍ여如ㆍ행行ㆍ출出]
<고멸도제>는 <고통을 제거한 상태>를 성취하는 <수행방안>이다.
이는 진리를 깨달아 열반에 <들어가는 길>이다. [도道 mārga]
그리고 이는 실상과 생사현실의 <올바른 이치>에 들어맞는다. [여如 nyāya]
이는 열반적정의 상태로 <올바로 향해> 나아가게 한다. [행行 pratipad]
그리고 이는 생사의 묶임을 <영원히 초월해 벗어남>에 이르게 해준다. [출出 nairyāṇika]
이처럼 수행방안을 관한다.
따라서 열반과 관련한 잘못된 견해들을 다스린다.
즉 현실에서 <열반에 이를 길>이 없다고 잘못 여기기도 한다.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방안>을 취하기도 한다.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또는 중간에 물러나거나, 또는 열반에 이름에 <부족한 방안>을 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열반에 이르는 잘못된 방안들을 제거한다.
♥Table of Contents
▣-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의 필요성- 생사고통의 제거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러면 <자신의 몸>도 보이고 <영희>나 <고양이>나 <꽃>이나 <바위>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정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올바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생사현실에서 많은 생명들이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무량겁에 걸쳐 <생사고통>을 반복해 겪는다.
그래서 이 생사고통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처할 때 이를 <극복>해 제거해야 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다시 무량한 <복덕>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생명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사고통>의 <정체>와 <그 발생원인>부터 살펴야 한다.
그리고 <목표 상태>로서 <생사고통이 제거된 상태>와 <그 성취 방안>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다음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우선 각 주체는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망집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래서 각 주체끼리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중첩해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업>으로 <인해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따라서 <생사고통>을 <예방>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즉 이는 <생사 고통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생사 고통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는 <수행>과 곧바로 직결된다.
<생사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일으킨 <망집>이다.
그러나 <망집>의 <뿌리>가 대단히 깊다.
한편 각 주체가 처한 <생사현실의 상황>은 각기 다르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방안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방안>에는 <다양한 단계>가 시설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기초적으로 <3악도 생사고통>을 벗어나 하늘에 이르는 단계 - 10선법, 보시, 계,
망집을 제거하여 <3계 생사묶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단계 - 계, 정, 혜
다시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3계 생사현실로 들어가는 단계 - 보리심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평안히 참고 극복해 물러나지 않는 단계 - 생사즉 열반관, 불퇴전위
중생을 제도할 <복덕>과 <지혜> 자량을 구족하고 <선교방편>에 의존해 중생을 제도하는 단계 - 바라밀다
<온갖 방편지혜>를 통해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중생제도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단계 - 3밀수행
생사현실에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끝내 <법신>을 증득해 성불하려는 단계 - 무량행문
그리고 단계별로 <생사현실>의 <정체>를 파악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이를 먼저 <불교>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4제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4제법>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살피기로 한다.
그런 가운데 <기초 내용>을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의 생사고통 [고제苦諦]
각 주체는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당장 고통을 겪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크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을 넓게 살펴본다고 하자.
그런 경우 삶에서 <각 주체가 겪는 고통>이 많음을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생사고통>을 잘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에서 각 주체가 겪는 <생사고통>을 대강 살펴보자.
먼저 한 주체가 처음 <생의 출발단계>에 <망집>을 일으킨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각 주체는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 생로병사 과정에서 먼저 <고통>을 겪는다. [생로병사고]
각 주체는 처음 낯선 환경에 태어난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며 삶을 시작한다. [생生]
그러다가 어느덧 뜻과 달리 늙어간다.
그리고 각 신체 기능이 쇠퇴한다.
그래서 불편과 <고통>을 겪는다. [노老]
또 살면서 사고나 질병을 만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병病]
그러다가 죽음에 직면해 두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다. [사死]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이런 <생사>를 <반복>해 나간다.
현실에서 당장 <이런 고통>을 당면한 상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임한 이상 그 누구도 <이런 고통>을 피하기 힘들다.
한편 각 주체는 <망집>에 바탕해 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소원>을 일으킨다.
그런데 현실에서 소원을 뜻처럼 잘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소원 성취에 대한 갈증ㆍ불만ㆍ불쾌ㆍ걱정ㆍ불안ㆍ슬픔ㆍ두려움 등을 겪는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구부득고]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우선 한 주체는 <망상분별>에 바탕해 <삶>에 임한다.
한 주체는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일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러면 각 주체 간에 서로 <침해>하고 <보복>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원수>관계로 서로 만나 <고통>을 겪어 나간다. [원증회고]
또 반대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애별리고]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망집>에 바탕해 <삶>에 임한다.
그런 경우 그 자신[5취온] 일체가 모두 <고통>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얻는 <생사현실 일체>가 <고통>이 된다. [5음성고五陰盛苦]
현실 일체는 다음 형태로 모두 고통과 관련된다.
우선 현실 일체는 본래 화합을 통해 얻는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현실 일체는 변화해간다.
그런 가운데 망집에 바탕한 삶은 결국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 [행고]
한편, 일시적으로 좋음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가 애착을 갖는 일체[5음]는 끝내 변화하고 허물어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통을 받게 된다. [괴고]
그런 가운데 각 주체는 원치 않는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 [고고]
♥Table of Contents
▣○ 생사고통을 겪는 원인 [고집제]
생사현실에서 생사 고통을 겪는다.
이에는 일정한 인과 관계가 있다.
즉,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 번뇌를 일으킨다.
=>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의업,구업,신업]
=>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사과정에서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처음 망집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구생기 신견]
그리고 있다ㆍ없다ㆍ영원하다ㆍ단멸한다는 등의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구생기 변견]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자신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탐욕, 분노를 일으키며 반응해간다. [탐ㆍ만ㆍ진ㆍ치]
그런 가운데 생을 출발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임한 이후 다시 온갖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우선 현실에서 자신과 외부 세상에 대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해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분별기 신견]
그리고 그 유ㆍ무 상ㆍ단에 대해서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분별기 변견]
그리고 현실 각 내용의 생멸과 인과에 대해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사견]
그런 가운데 세상의 각 내용에 대해 온갖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견취견]
또한 가치와 이를 성취할 방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계금취견]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얻는 현실 내용을 실답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자신이 엉터리로 분별한 내용도 역시 실다운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후 이런 망집번뇌에 바탕해 소원을 일으켜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해간다.
그런데 이처럼 망집을 일으킨 주체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각 주체들이 서로 가해 피해 관계를 중첩해 쌓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해 업의 장애가 쌓인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극심하게 받는 상태에 묶이게 된다. [혹-업-고/ 욕계내 3악도]
현실 사례를 놓고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사고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쉬려고 산을 올라갔다.
그런데 멀리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금으로 잘못 볼 수 있다. [망집번뇌-혹]
그래서 금을 주우려고 그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업]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그래서 허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남은 생을 평생 장애 상태로 고통을 받고 지내게 된다. [고통]
이런 사고의 경우 하나도 이처럼 관계를 나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고통은 어느 순간 아무 원인 없이 받게 된 것이 아니다.
즉 다음처럼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침대에서 누어 잤다.
그러나 일어나 보니 홀연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허리가 부러진 상태가 된 것이 아니다.
또는 절대적 신에 의해 어쩔 도리 없이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침대에서 누어 잤다.
그런데 신이 갑자기 자신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자신을 집어 던졌다.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다.
또는 숙명에 의해 어쩔 도리 없이 발생한 일도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침대에서 누어 잤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달리 숙명적으로 산에 올라가게끔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달리 낭떠러지를 향해 옮겨 갔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생사현실내 고통은 위와 같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생사현실에서 생사 고통을 겪는 데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
즉, 망상분별 번뇌 - 이에 바탕해 행하는 업 - 고통의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 과정을 먼저 잘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먼저 가장 근본적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과 번뇌를 먼저 일으킨다.
따라서 이 내용부터 살피기로 한다.
▲▲▲-------------------------------------------
● 이상의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58~72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3장_부처님의_가르침_(0).txt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001.txt
-------------------------------------------
♥Table of Contents
▣- 욕계의 소원의 성취 과정의 문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망집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한다.
그리고 자신의 좋음을 집착한다.
그래서 탐욕을 일으켜 추구해간다.
그리고 나쁨에는 분노로 반응한다.
이처럼 망상분별과 탐ㆍ진ㆍ치 3 독에 바탕한다.
그런 가운데 소원을 일으킨다.
또한 인과도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한다.
그런 가운데 소원을 성취할 방안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업을 행해간다.
그처럼 한 주체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추구한다.
그래서 <감각현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행한다.
그런 경우 이에 따라 다른 주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각 주체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각 주체들 간에 가해 피해관계가 형성된다.
욕계에서 각 주체는 일정한 <감각현실>을 엇비슷하게 얻는다.
그리고 한 주체가 <감각현실>을 변화시키면 다른 주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감각현실>은 각 주체가 얻어낸 마음 내용이다.
그래서 <감각현실>을 변화시키려 업을 행한다.
이런 경우 언뜻 다른 주체와는 관계가 없을 것처럼 여기기 쉽다.
그러나 <감각현실>은 오로지 그 주체의 마음만으로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본바탕 실재 영역에서 그런 <감각현실>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감각현실>은 실재를 바탕으로 각 주체의 마음이 화합해 얻어낸다.
그리고 일정한 연기관계에 구속을 받는다. [의타기상]
그런 경우 <감각현실>은 관념에 응해 바로바로 얻어질 수는 없다.
<감각현실> 영역은 여러 조건에 의해 변화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성취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주체가 업을 행한다.
그러면 이는 실재 영역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 주체가 함께 대하게 된다.
그리고 각 주체가 <감각현실>을 얻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한 주체가 <감각현실>을 변화시키면 다른 주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각 주체 간에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러면 다른 주체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상태가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닭을 잡아 끼니를 때운다고 하자.
자신은 이런 상태가 좋음을 준다고 여긴다.
그러나 상대는 이로 인해 지극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각 주체 간에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르다.
그로 인해 각 주체는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고받는 관계에 놓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를 해치거나 보복을 주고받게 된다.
그리고 각 주체 간에 가해 피해관계가 중첩해 쌓이게 된다. [업을 통한 가해피해관계의 중첩]
그래서 장애가 쌓이게 된다. [업의 장애]
이는 결국 각 주체의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일 한 주체의 업이 순수하게 그 주체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자. [예: 마음안 공종자(共種子)]
그렇다면 다른 주체와 관계될 이치는 없다.
그런데 각 주체는 이들 실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얻게 된다.
본바탕 실재는 공하다.
그러나 이는 실재에 전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각 주체가 본바탕을 함께 대한다.
그런데 각 주체의 감각기관과 인식기관 구조가 서로 엇비슷하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각 주체는 서로 비슷한 <감각현실>을 얻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한 주체가 <감각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업을 행한다.
이 상황에서 다른 주체도 본바탕 실재에 바탕해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그로 인해 다른 주체도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실재와 현실의 관계도 이와 함께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바탕 실재는 한 주체가 끝내 얻어내지 못한다.
한 주체는 그가 관계해 화합해 얻는 내용만을 얻는다.
본바탕 실재는 그런 관계를 떠나 있는 그대로의 상태다.
그래서 한 주체가 그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 내용은 각 주체가 화합해 얻어낸다.
그래서 실재와 <감각현실>의 관계는 마치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감각현실>은 실답지 않다.
▼▼▼-------------------------------------------
이하부분은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73 ~81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8장_2유식_2_5위백법.txt
cf 부파불교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001.txt
-------------------------------------------
♥Table of Contents
▣-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
한 주체가 현실에서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이처럼 생사현실의 정체에 대해 잘못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좁고 짧고 얕은 관찰에 바탕해 가치와 인과를 판단한다.
그래서 좁게, 오직 자신이나 가족만 고려한다.
또 대단히 짧게, 당면한 당장의 순간만 고려한다.
또는 짧게, 1생의 기간만을 고려한다.
또 얕게, 자신이 관심 갖고 초점을 맞추는 측면만 고려한다.
그런데 넓고 길고 깊게 생사과정을 이어 이를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부분 정반대 방향이 된다.
그런 가운데 좋고 나쁨을 분별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현실 내용에 애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일으킨다. [탐진치 3독]
그리고 이에 집착을 일으킨다. [망집번뇌]
그런 경우 인과관계에 대해 잘못된 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를 대단히 짧게 관찰한다.
생사과정에서 한 주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경우 자신과 관련된 것은 모두 끝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사후에 자신과 관련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오직 현재의 한 생만을 짧게 고려하며 삶에 임하게 된다. [단멸관]
이처럼 망상분별에 바탕해 단멸관을 취한다.
그러면 단멸관에 바탕한 목표나 방안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단멸관이 일으키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유로 농사를 들어보자.
봄에 씨를 뿌린다.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 수확할 수 있다.
그러나 짧게 봄만 놓고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여긴다.
그래서 봄에 씨를 다 식량으로 먹어 없애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
그런 경우 길게 1년, 10년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와 정반대 방향이 된다.
그런데 단멸관에 바탕해 좋다고 여기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뜻을 성취하는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업]
그리고 오히려 각 주체가 희망한 내용과 반대 상태에 처하게 된다. [ 구부득고]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 나간다. [생사고통]
생사현실도 이와 사정이 같다.
짧게 1생만 놓고 판단한다.
그런 경우 무량겁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와 대부분 반대 방향이 된다.
생사현실에서 이런 고통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이런 고통을 삶에서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먼저 생사고통의 정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생사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에 바탕해 생사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근본 원인은 근본 무명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일으키는 잘못된 망상분별과 집착이다.
따라서 잘못된 망집 번뇌 가운데 대표적 내용을 아래에 나열해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신견身見]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그 가운데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색ㆍ성ㆍ향ㆍ미ㆍ촉 및 수ㆍ상ㆍ행ㆍ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5온을 나[我] 또는 나의 것[我所]이라고 잘못 여긴다. [유신견有身見, 살가야견薩迦耶見 satkāya-dṛṣṭi]
그러나 현실내용은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을 얻는 그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따라서 위 판단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대부분 이런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먼저 그런 부분은 살아가는 동안 늘 일정하게 있는 부분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영원히 유지되는 내용으로서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상일]
또 그 부분은 자신 뜻대로 움직이고, 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 여긴다. [주재]
그리고 그 부분에 대상을 파악하는 감관이 위치한다고 여긴다.
즉, 그런 부분에 주관이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대상에 대한 주관]
그래서 그 부분을 곧 자신으로 잘못 취한다.
이런 사정으로 이를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잘못 분별한다.[분별기신견]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깨끗하다고 여긴다. [상-락-아-정]
그리고 집착을 갖고 임한다.
그런데 이는 사실은 생을 출발하는 단계 이전에 일으킨 망상분별에 그 근원을 둔다.[구생기신견]
즉 처음 제7식이 이미 일정부분을 취하여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아치我癡ㆍ아견我見ㆍ아만我慢ㆍ아애我愛]
그리고 이에 바탕해 태어나 살아간다.
그런 가운데 후발적으로 다시 의식 표면에서 분별을 행한다.
즉, 제6식이 다시 신견을 일으키게 된다.[분별기신견]
그래서 현실에서 얻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Table of Contents
▣- 영원함과 단멸관을 취함 [변견邊見]
상(常)과 단(斷) 두 극단[二邊]에 집착하는 입장이 있다.[변집견邊執見, antagrāha-dṛṣṭi]
현실에서 스스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겨 취한다.
그런 경우 그 부분은 계속 그 상태로 영원히 유지된다고 잘못 분별하기 쉽다. [상견常見, nityadrsti, śāśvatadrsti]
그처럼 자신의 정체에 대해 잘못 이해한다.
그런 경우 이들에 참된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다고 여기기 쉽다.
그리고 그런 실체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그처럼 얻게 된다고 여긴다.
그리고 현실은 이런 실체적 요소가 쌓여 얻어진다고 여기기도 한다. [적취설積聚說]
또는 현실은 이런 실체가 각 경우 변화해 얻어지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전변설轉變說]
그리고 현실에 그처럼 영원히 상주불변하는 실체가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러나 실체가 영원불변하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한편 변화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주장은 앞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즉, 자체 모순이다.
따라서 이는 잘못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견해를 갖는다.
그런 경우 이는 유의 극단에 치우친 입장이다.
이 경우 현실을 대단히 실답게 여기고 집착한다.
그래서 그 바탕에서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는 생사고통을 겪는 주된 원인이 된다.
또 한편 다음처럼 단멸관을 취하는 입장도 있다.
현실에서 스스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겨 취한다.
그런 경우 자신의 몸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듯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몸은 조금씩 변화한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는 생사과정에서 끝내 소멸된다.
그러면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은 그것으로 모두 끝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죽음 이후 자신과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고 잘못 이해한다. [단멸관]
이는 또한 무의 극단에 치우친 잘못된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단멸관을 취한다.
그런 경우 자신은 한 생만 놓고 관찰한다.
그래서 이런 한 생만 고려하며 삶에 임한다.
그리고 삶의 목표도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잘못 설정한다.
그런 경우 매순간, 세속적 감각적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임하기 쉽다.[순세파 Lokāyata]
그리고 그 성취방안도 마찬가지로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해 찾는다.
그래서 이처럼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한 가운데 삶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 경우 이로 인해 대부분 장구하게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탐ㆍ진ㆍ치ㆍ만 [미사혹, 수혹]
현실 내용 가운데 일 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몸'이라고 잘못 여긴다.[신견]
그리고 이들 내용이 영원하다고 잘못 여긴다. [상견-변견]
또는 이들 내용이 사후 끊겨 아주 없게 된다고 여긴다. [단견-변견]
이런 신견과 변견은 태어나 살면서 분별하는 과정에서도 일으킨다. [분별기分別起 신견, 변견]
그러나 신견과 변견은 사실은 생을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일으킨다. [구생기俱生起 신견, 변견]
즉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는 선천적인 번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너무 바삐 생활한다.
그래서 스스로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사고로 의식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도 평소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 부분은 평소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너무 바쁘다.
그래서 머리나 손과 발을 일일이 자신 몸이라고 '분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어떤 모임에 바삐 나갔다.
그렇다고 그런 각 부분이 따로 떨어진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 부분은 현실에서 하나의 몸이 갖는 일정한 특성을 계속 갖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제 6의식에서 행하는 분별에 바탕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는 구생기 신견에 바탕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을 출발하기 이전에 제7식에서 구생기(俱生起) 신견과 변견을 일으킨다.
이런 바탕에서 생을 출발한다.
그런 분별 과정에서 다시 신견과 변견을 일으키게 된다. [분별기 신견, 변견]
즉, 제 6의식에서 행하는 분별은 후발적이다.
그래서 신견, 변견의 근원은 깊다.
처음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생을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 처음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그에 집착한다. [아치ㆍ아견ㆍ아애ㆍ아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 가려 한다.
그런 가운데 이런 자신에 무언가가 유리하고 좋은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좋음에 탐욕을 일으킨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에 만심을 갖는다.
한편, 자신에 손해되고 나쁨을 주는 것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탐(貪)ㆍ진(瞋)ㆍ치(癡)ㆍ만(慢)의 번뇌를 일으킨다.
먼저 자기의 뜻에 잘 맞고 좋아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경우 이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싫어함이 없다.
그래서 이에 애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달라붙어 감촉을 계속 행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좋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를 바라고 구한다.
이를 탐이라고 한다. [탐貪 lobha, rāg, rāga, abhidhyā]
탐욕(貪欲)ㆍ탐애(貪愛)ㆍ탐착(貪著)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는 간단히 욕(欲)ㆍ애(愛)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경우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또는 미워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뜨겁게 괴롭힌다.
그리고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서 떨어져 멀어지려 한다.
또는 이를 부수어 파괴하고자 한다.
이를 진(瞋)이라 한다. [진瞋, pratigha, dveṣa]
진에(瞋恚)ㆍ진노(瞋怒)ㆍ에(恚)ㆍ노(怒)등으로도 표현한다.
진(瞋)은 탐ㆍ진ㆍ치 3독 가운데 그 허물이 극히 심하다.
치(癡)는 진실을 바르게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치와 사물에 대해 어두운 상태다. [치癡 moha, 무명無明, avidyā․mūdha]
모든 번뇌는 치(癡)가 결부되어 일어난다. (『성유식론』 권6)
만(慢)은 타인과 비교하여 오만한 마음 상태를 뜻한다. [만慢 māna] 29)
만은 다시 7만으로 나누기도 한다.
① 자신보다 열등한 자에 대해 자신이 더 뛰어나다 한다. 또는 동등한 이에 대해서 동등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 들어올린다. 이를 만(慢)이라 한다.
② 자신과 동등한 자에 대해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한다. 혹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이에 대해 자기와 동등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과만(過慢)이라 한다.
③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이에 대해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만과만(慢過慢)이라 한다.
④ 자신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五取蘊]을 영원한 나(我)다, 나의 것[我所]이라고 집착한다. 이로 인해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아만(我慢)이라 한다.
⑤ 아직 예류과(預流果) 등의 뛰어난 과를 증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미 증득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증상만(增上慢)이라 한다.
⑥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가 있다. 이에 대해 자기가 조금만 열등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비만(卑慢)이라 한다.
⑦ 없는 덕을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사만(邪慢)이라 한다.
(『입아비달마론』 권 상)
이들은 모두 자기와 타인의 높고 낮음 등을 따진다.
그런 가운데 타인을 경멸한다.
그리고 자신의 저열한 상태에서 자만에 빠진다.
그래서 보다 높은 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근본 번뇌로 삼는다.
이들 탐ㆍ진ㆍ치ㆍ만 번뇌는 생을 유지하는 한, 쉽게 끊어내기 힘들다.
이런 탐ㆍ진ㆍ치ㆍ만은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번뇌의 성격을 갖는다. [미사혹迷事惑 ]
그리고 이후 이런 바탕에서 현실에 임한다.
그 상태에서 이후 이치에 어긋난 잘못된 망상분별을 계속 일으켜 나간다. [미리혹迷理惑]
♥Table of Contents
▣- 잘못된 인과 판단 문제 [사견邪見]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관련된다.
그래서 이들 각 요소의 관계를 넓고 길고 깊게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피상적으로 관찰한다.
그래서 잘못된 인과 판단을 행한다. [사견邪見, mithyā-dṛṣṭi]
우선 현실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인과부정론]
그러나 현실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그렇다고 모든 것이 서로 인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지 선후로 이어지는 내용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과를 잘못 이해하면 이들을 원인과 결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현실에서 인과의 정체나 성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많이 행한다.
예를 들어 원인에 이미 그 결과가 들어 있었다고 치우쳐 이해한다. [인중유과론]
또는 원인에 결과는 없었다고 치우쳐 이해한다. [인중무과론]
한편, 인과론을 통해 기계적 인과율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 다음처럼 이해하기 쉽다.
모든 현실은 인과에 의해 그렇게 나타나도록 결정된 것이다. [기계적 인과율에 의한 결정론]
또는 현실은 과거에 행한 업에 의해 어쩔 도리 없이 나타난다. [숙명론]
또 미래 내용도 이미 과거에 모두 그처럼 나타나도록 정해진 것이다. [사전결정론, 예정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삶에서 어떤 이가 인과부정론이나 우연론을 취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수행과 관련한 4성제(四聖諦)도 부정하게 된다.
그런 경우 생사고통을 피할 올바른 방안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수행노력도 기울이지 않기 쉽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아무 것도 행하지 않으려 한다.
또는 반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때 그 때 아무렇게 행하려 한다.
그렇게 아무렇게 임해도 무방하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또 한편, 삶에서 숙명론이나 사전 결정론을 취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고통 일체를 체념해 받아들이려 하기 쉽다.
즉, 고통은 본래 피할 수 없도록 정해진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또는 반대로 장래 좋은 결과는 노력 없이 저절로 성취된다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피할 올바른 방안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수행노력도 기울이지 않기 쉽다.
그리고 일체를 숙명에 맡긴다.
그리고 방일한 자세를 취하기 쉽다.
한편, 현실에 적용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이런 내용이 본바탕에도 실재한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런 경우 현실 내용이나 그 관계를 실답게 여기며 집착한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그러나 본래 인과관계를 잘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통해 오히려 본바탕 실재가 공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과의 구체적 관계와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의 원인을 엉뚱한 것에 찾게 된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 그 책임을 지나치게 묻게도 된다.
또 그런 경우 삶을 전체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현실에 대한 온갖 잘못된 이해 [견취견見取見]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분을 취해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신견]
그런 경우 이를 바탕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외부 세계'라고 잘못 여긴다. [외부세계]
그리고 현실내용을 자신과 외부로 2분해 대한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한다.
즉 이들 내용은 자신과 영희 철수가 다 함께 대하는 외부내용으로 잘못 이해한다. [외부의 객관적 실재]
한편 이들 내용을 감관이 대한 외부 '대상'으로 잘못 여긴다.
우선 자신의 감각과정에서, 자신이 대한 외부대상으로 잘못 여긴다. [자신의 감각의 외부대상]
한편 이를 자신이 동작할 때 손발 등 운동기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자신의 동작의 대상]
한편 이는 다른 영희나 철수의 감각과정에서 그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타인들 감각의 외부대상]
또 이는 다른 영희나 철수가 동작할 때 손발 등 운동기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타인들 동작의 대상]
한편, '<감각현실>'은 다른 느낌이나 관념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 <감각현실>은 정신이 얻어낸 내용이 아닌 외부의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또는 이들 <감각현실>은 정신과 떨어져 있는 별개의 내용으로 여긴다.
한편 '물질'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런 가운데 이들 <감각현실>을 외부 '물질'로 잘못 여긴다. [외부물질]
이처럼 기본적으로 현실 내용의 각 정체와 성격에 대해 잘못된 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사정으로 반대로, 자신과 외부 세상에 해당할 부분을 잘못 '가리킨다'.
그런데 사실 이들 내용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성격과 지위를 갖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
그러면 현실 각 내용의 정체와 관계를 잘못 파악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감각현실>은 자신이 대한 외부대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그 <감각현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 경우 대상과 그 대상으로부터 얻어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감각현실>은 자체적으로 옳은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이처럼 하나의 <감각현실>에 대해 잘못된 지위와 성격을 부여한다.
그런 가운데 이런 혼동을 일으킨다.
한편 <감각현실>과 분별의 관계도 잘못 이해한다.
더 나아가 본바탕 실재와 <감각현실>의 관계도 잘못 이해한다.
또 본바탕 실재와 관념분별의 관계도 잘못 이해한다.
한편 현실에서 현실 내용 일부를 다른 내용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예: 말소리, 글자]
예를 들어 <감각현실>과 분별 가운데 일부를 취해 이처럼 다른 내용을 가리키는데 사용한다.
이를 언어라고 한다. [언설명자]
한편 언어는 영역과 성격이 다른 수많은 각 내용을 다 가리킬 수 있다.
그런 사정으로 다시 언어와 이들 각 내용의 관계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 가운데 세상에 대해 온갖 잘못된 견해와 주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언설로 이를 주장하며 고집하게 된다. [견취견見取見 dṛṣṭiparāmarśa]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견해를 달리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다툰다.
또 잘못된 견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이들은 견해에 바탕한 번뇌다.
이들은 그 폐해가 현실에서 대단히 날카롭다. [이사利使]
예를 들어 세상의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이런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만, 그 견해의 잘못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또 이런 지적 번뇌는 오히려 쉽게 끊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감정적, 정서적, 의지적 번뇌와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탐ㆍ진ㆍ치ㆍ만과 같은 번뇌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끊지 못한다.
여하튼 각 주체는 이들 번뇌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따라서 이를 올바로 시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삶은 잘못된 망상분별을 바탕으로 행해가게 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생사고통을 겪는 근본 원인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계금취견戒禁取見
현실에서 각 내용의 정체와 성격을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서로간의 인과 관계도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판단도 잘못 행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구한다.
그러면 잘못된 내용을 목표로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방안으로 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현실의 고통을 피해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런데 산 생명을 죽여 하늘에 제를 올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엉뚱하게 생각한다.
또는 단지 하늘만 믿으면 악을 함부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는 고행으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올바른 목표를 위해 성취할 계율이나 금지사항에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
이를 계금취견[戒禁取見 śīla-vrata-parāmarśa]이라 칭한다.
그런 경우 올바른 계를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함부로 행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업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히려 생사고통을 더 장구하게 겪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는 생사고통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의심 [의疑]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삶에 처음 임한다.
그래서 각 현실내용의 본 정체와 성격 및 관계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과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올바른 진리도 알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올바른 내용을 스승이나 부처님이 제시한다.
그래도 그 내용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자꾸 의심한다.
그리고 뜻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 유예 상태로 임하게 된다. [의疑 saṃdeha]
이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심한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의심을 갖는다.
그리고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좁고 짧고 얕은 관찰과 경험에 바탕해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해나간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는 생사고통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현실을 진짜이며 실답다고 여기는 자세의 문제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이에 대해 잘못된 분별을 행한다. [신견ㆍ변견ㆍ사견ㆍ계금취견ㆍ견취견]
그런 가운데 각 현실 내용의 정체나 지위를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를 꿈과 달리, 실다운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를 집착하게 된다.
특히 집착에 있어서는 신견이 가장 문제된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신견]
그리고 이런 내용을 참된 진짜이며 실다운 내용으로 여긴다.
그러면 이에 집착을 강하게 갖게 된다.
그리고 한 주체가 일으키는 집착은 대부분 이런 자신의 집착에 바탕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소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업을 행해 나간다.
그러면 다른 주체와 가해 피해 관계를 쌓게 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생사고통을 예방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업을 중단해야 한다.
업이 고통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을 중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망상분별과 집착에 바탕해 업을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견ㆍ변견ㆍ사견ㆍ계금취견ㆍ견취견 등을 잘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 내용이 진짜며 실답다고 여긴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집착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현실이 참된 진짜가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한다.
즉 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실을 대부분 참된 진짜며 실답다고 여긴다.
그런데 현실을 이처럼 실답게 여기게 되는 배경 사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사정이 결국 현실에서 이런 집착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업을 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실답게 받아 나간다.
그래서 이런 배경사정은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실답게 여기게 만드는 배경 사정부터 잘 살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이 참된 진짜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
이상은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73 ~81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8장_2유식_2_5위백법.txt
cf 부파불교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001.txt
< $ 73 ~81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을 참된 진짜이고, 실답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정
생사현실은 참된 진짜가 아니다.
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런데 생사현실이 완전히 꿈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고통을 겪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단지 꿈을 깨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쉽게 생사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생사현실을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잘 이해하며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면 별도로 수행 노력할 필요성이 적다.
한편, 생사현실을 누구나 쉽게 꿈처럼 여기며 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별도로 수행 노력이 그다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생사현실을 대부분 참된 진짜로 여긴다.
그래서 꿈과는 달리 실답고 참된 진짜내용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에 잘못된 집착을 갖는다.
현실은 본질적으로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실답다고 잘못 여기게 되는 사정이 있다.
이를 요약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 풍부하게 중첩해 현실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현실은 실답다고 여긴다.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켜 결합시킨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현실 내용을 외부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감각현실>의 각 부분의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실재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다수가, 일정 시간, 장소, 조건에서 일정 내용을 반복 경험한다. 이는 외부에 상응한 실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본바탕 실재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를 실답다고 여긴다.
- 참된 진짜 뼈대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현실 내용을 얻는다고 잘못 분별한다. 그래서 현실이 실답다고 여긴다. [실체설]
즉, 현실은 이처럼 꿈과 다른 여러 특성을 갖는다.
이런 여러 사정들로 현실을 꿈과 달리 실답게 여긴다.
이를 아래에서 하나하나 나열해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풍부하게 중첩해 현실 내용을 얻음
한 주체는 현실에서 다양한 성격의 내용을 얻는다.
먼저 각 주체는 각 <감각현실>을 매순간 생생하게 중첩해 얻는다. [색ㆍ성ㆍ향ㆍ미ㆍ촉]
그리고 이에 대해 좋고 나쁨의 느낌을 얻는다. [수]
그리고 이에 대해 명료하게 분별을 일으키고 업을 행한다. [상ㆍ행ㆍ식]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른 것에 의존해 일으켜 얻은 것이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꾼 바다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 각 내용을 각 영역에서 화합해 다양하게 얻는다.
이들 각 내용은 서로 대조하면 서로 대단히 엉뚱하다.
사과를 하나 대한다.
이 경우 눈으로 색을 본다.
손으로 두드려 소리를 듣는다.
또 코로 대해 향을 맡는다.
또 입으로 맛을 본다.
또 손으로 만져 촉감을 얻는다.
그런데 눈으로 본 색은 소리, 향, 맛, 촉감과 대단히 엉뚱하다.
또 사과를 두드린 소리는 사과의 색, 향, 맛, 촉감과 대단히 엉뚱하다.
또 눈을 감고 사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각 <감각현실>과는 대단히 다르다.
이처럼 각 영역에서 얻는 내용이 서로 대단히 다르고 서로 엉뚱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각 <감각현실>을 생생하고 다양하게 얻는다.
좋고 나쁨의 느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관념영역에서 분별을 명료하게 행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 각 내용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상태에 놓인다.
그런 가운데 이를 대단히 실답게 여기게 된다.
예를 들어 세상에 가짜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 가짜가 서로를 보증하고 긍정한다.
그러면, 이후 가짜가 서로서로 진짜처럼 행세하게 된다.
이런 현상과 같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킴
먼저 다음 비유를 살펴보자.
어떤 이가 기차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후 바나나란 생각을 연상해 '일으킨다'고 하자.
그렇다고 기차에 바나나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기차가 곧 바나나인 것은 아니다.
또 손바닥을 부딪쳐 소리가 난다.
그렇다고 손바닥에 소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곧 손뼉소리인 것도 아니다.
침대에 누워 바다 꿈을 꾼다.
그렇다고 침대에 바다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침대가 바다인 것도 아니다.
꿈을 깨어난 후, 침대가 놓인 현실과 꿈을 서로 대조해 본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엉뚱함을 이해한다.
그래서 꿈은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현실에서 <감각현실>을 대해 관념을 일으킨다.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또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이들 두 내용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 성격은 꿈과 마찬가지다.
<감각현실>과 관념의 관계는 침대에 누워 꾼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런데 <감각현실>과 관념은 또 꿈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들은 '꿈과 달리' 한 주체의 내부에 함께 머문다. [5구의식]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 경우 처음 <감각현실> 일정 부분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감각현실> => 관념)
그런 경우 <감각현실>과 관념 내용을 한 주체가 동시에 얻게 된다.
한편 평소 일정한 부분을 대할 때 일정한 관념을 반복해 일으킨다.
그런데 한편, 그는 다른 부분을 대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후 반대로 그런 관념내용으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키게' 된다. (관념 => <감각현실>)
이들은 본래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 두 내용이 함께 머물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일으키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서로 결합시켜 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사정으로 이후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즉 관념영역에서 <감각현실>과 관념분별을 재료로 다음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먼저 <감각현실>을 중심으로 다음처럼 잘못 분별한다.
즉, 그 <감각현실> 일정 부분에 그런 관념이 본래 들어 '있었다'고 잘못 여긴다.
또 <감각현실> 부분은 곧 그런 관념 '이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두 내용을 이처럼 결합시켜 잘못 이해하게 된다.
또 한편, 반대로 관념을 중심으로는 다음처럼 다시 잘못 분별한다.
우선 그런 <감각현실> 부분은 곧 그런 관념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이해한다.
즉 그 관념은 그런 <감각현실>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다고 잘못 분별한다.
그리고 그 관념은 곧 그런 <감각현실>'이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이들 두 내용을 서로 양방향으로 결합시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서로 접착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 일정부분을 대해 '책'이라는 생각을 반복해 '일으킨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책이란 관념을 바탕으로 일정한 <감각현실>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후 관념영역에서 관념과 <감각현실>을 결합시키게 된다.
그리고 관념영역에서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래서 현실에서 상을 취하며 임하게 된다.
즉 그런 생각[想]을 바탕으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相 Lakṣaṇa]을 취한다.
그리고 곧 그 부분이 그런 책'이다'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누군가 책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일정 부분을 책이라고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이는 그가 그런 <감각현실> 부분을 그런 관념내용'이다'라고 잘못 분별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런 관념 내용이 <감각현실> 영역에 그처럼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그런 <감각현실> 부분은 곧 그런 책'이다'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관념내용으로서 책이 들어 '있다'고 여긴다.
한편 그런 사정으로 그 부분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을 반복해 일으키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처럼 <감각현실>과 관념을 결합시켜 이해한다.
그러나 그가 가리키는 부분은 <감각현실> 부분이다.
이 경우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또한 관념도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관념 안에 <감각현실>은 없다. [변계소집상의 상무자성]
물론 어떤 관념은 처음부터 <감각현실>에서 상응한 내용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토끼뿔, 거북털, 도깨비, 허수 등 독영경獨影境 )
그러나 일정한 <감각현실>을 대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고 하자.
이런 경우의 관념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런 관념은 <감각현실> 영역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로 이해한다. (성경性境, 또는 대질경帶質境)
그런 사정으로 이들 관계에 대해 다음처럼 잘못 이해한다.
즉, 이런 관념들은 <감각현실>과의 관계가 <꿈과 현실의 관계>와 다르다고 이해한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 꾼 바다 꿈은 서로 엉뚱한 관계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관념이 그처럼 실답게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 부분을 대해 적절한 관념을 정당하게 일으킨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들 관념은 꿈과 달리, 실다운 내용이라고 여긴다.
또 현실에서 대부분 이런 바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해가게 된다.
* 이런 망상분별의 문제가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을 관련부분에서 반복해 살피게 된다.
[참고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킴]
[참고 ▣-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참고 ▣- 무상삼매 ]
[참고 ▣- 관념이 실답지 않은 사정 - 환자와 가족의 비유를 통한 이해]
♥Table of Contents
▣- 현실 내용을 외부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함
-- <감각현실>을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함
한 주체가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먼저 이런 현실내용의 정체나 성격을 잘못 이해한다.
예를 들어 조각상 하나를 영희와 철수와 함께 대한다.
이 상황에 영희는 조각상 뒷면을 대한다.
또 철수는 조각상 옆면을 대한다.
그리고 자신은 조각상 앞면을 대한다.
그래서 각 주체가 얻는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들이 관찰한 내용은 각 주체가 각기 얻어낸 내용이다.
이 상황에서 자신은 '철수가 얻은 내용'을 대상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다.
철수도 '자신이 얻은 <감각현실>'을 대상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각 주체는 다음처럼 잘못된 분별을 일으킨다.
즉, 이 경우 각기 자신이 얻는 내용을 다른 주체가 함께 대한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각 주체 상태가 엇비슷하다.
그래서 망집을 일으키는 현상도 서로 엇비슷하다.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외부 세상, 외부대상, 외부물질로 여기고 대한다.
그런 경우 다른 주체도 망집의 상태가 엇비슷하다.
그래서 제각각 그런 부분을 그처럼 여긴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다수 주제간 언어 소통을 행한다.
그런 가운데 각기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러면 그런 감각내용이 곧 외부에 실답게 존재한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감각현실>을 실다운 내용으로 잘못 이해한다.
-- 관념내용을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함
한편 이들 <감각현실> 각 부분에 대해 제각각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각 부분의 정체나 성격에 대해 잘못된 분별을 행한다.
그런데 이 경우 그런 분별내용이 <감각현실> 영역에 그처럼 '있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러면 다시 그런 분별내용도 또한 그처럼 그 부분에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잘못 이해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바위라고 여긴다.
그 상황에서 다른 영희나 철수도 개별적으로 일정한 내용을 각기 얻는다.
그리고 다른 영희나 철수가 각기 엇비슷하게 일정부분이 바위라고 여긴다.
한편 각 주체는 다른 이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즉, 각기 다른 주체가 어떤 <감각현실>을 얻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또 그런 <감각현실>을 대해 어떤 분별을 일으켰는지는 직접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런 가운데 서로 언어 소통을 행한다.
이런 경우 자신(갑)이 바위로 여기며 대하는 일정부분이 있다.
그런데 언어소통을 통해 다른 이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대한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또 이를 다 함께 바위로 여긴다고 잘못 이해한다.
처음 자신이 <감각현실>을 얻었다.
그런데 이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즉 이 내용을 자신과 철수 등이 다 함께 대하는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그에 대해 일으킨 관념분별 내용이 있다.
이 경우 그런 관념분별 내용도 역시 그처럼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그런 관념분별 내용도 그처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이는 천문학자들의 관찰과 사정이 같다.
어떤 천문학자가 처음 망원경으로 어떤 별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계에 보고한다.
예를 들어 하늘에 별이나 달이 떠 있다고 보고한다.
이 때 그 천문학자는 그가 관찰한 내용을 곧 자신이 대한 외부대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나 천문학자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 망원경에 눈을 댄다.
그러면 그들도 엇비슷한 내용을 다시 얻는다.
그리고 그들도 제각각 그 내용을 자신의 감관이 대한 외부대상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들이 관찰한 내용은 각 주체가 각기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갑)은 (을)이 본 내용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각기 관찰한 내용은 각 주체가 대한 외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기 관찰한 내용은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즉 자신과 갑, 을이 모두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서로 언어소통을 한다.
이 상황에서 제 각각 감각해 얻어낸 현실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런 <감각현실>을 객관적인 실재로 제각각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각각 이해한 내용이 다시 있다.
그런 가운데 처음 천문학자가 관찰 보고한 내용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하자.
이 경우 각 주체는 그 <감각현실> 영역에 그런 분별내용이 그처럼 '있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러면 그런 분별내용도 또한 객관적으로 실재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현실에서 행하는 나머지 분별내용들도 사정이 같다.
각 주체가 <감각현실> 각 부분에 대해 일으키는 분별이 무량하다.
이들은 대부분 각 주체가 일으킨 잘못된 분별 내용이다.
물론 감관과 상태가 전혀 다른 생명들이 현실에 많다.
이런 경우 그런 다른 생명체는 그런 내용을 그처럼 얻지 못한다.
그런 경우 분별 판단도 그처럼 공통된 형태로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 서로 간에 언어소통도 되지 않는다.
그런 사정으로 다른 생명체들의 입장은 무시된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가 개나 고양이의 입장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수가 서로 엇비슷한 감관을 갖는다.
그리고 엇비슷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언어소통을 한다.
그리고 일정한 내용을 서로 지지한다.
각 주체가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이 경우 먼저 이를 다수가 함께 대하는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정한 분별을 일으킨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이가 똑같은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내용을 대해 시인은 다른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연상해 떠올린다.
또 일정한 내용에 대해 좋고 나쁨의 판단은 각 주체마다 많이 다르다. [가치판단]
그러나 다수가 비교적 공통적으로 일으키는 관념분별도 있다. [사실 판단]
이 경우 이런 관념분별 내용은 그런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런 분별내용을 그런 <감각현실>과 결합시켜 이해한다.
이런 사정으로 이들 현실 내용은 꿈과 달리, 실다운 내용이라고 잘못 여기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의 각 부분의 특성이 달라 그 실재가 있다고 여김
현실에서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내용에, <이들 내용을 얻는 주체>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또 그런 내용에, <이들 내용을 얻게 한 외부 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이들 현실 내용은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주체가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감각현실>을 살핀다.
이 경우 각 부분의 특성이 달리 파악된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를 놓고 생각해보자.
그런 경우 생활 경험상 이들 내용의 각 부분은 특성이 달리 파악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움직이고자 한다고 하자.
이 경우 그 뜻에 따라 움직여 변화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나뉜다.
또 각 부분에 손을 댄다고 하자.
그 경우 촉감이 느껴지는 면도 다르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얻은 <감각현실> 각 부분의 특성이 다르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또 다른 부분은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 영희 철수로 여긴다.
언어 소통을 통해 이들은 자신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갖는 것을 관찰한다.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생명체, 개, 고양이 등으로 여긴다.
이 경우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외관상 거의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짐을 관찰한다.
또 다른 부분은 무생물체인 바위, 산 등으로 여긴다.
이들 부분은 생명체와 많이 특성이 다름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들 각 부분은 여러모로 특성이 달리 파악된다. [ 자신의 몸- 동일한 인간 - 생명 - 무생물 ]
그래서 그 사정이 무엇인가를 추리하게 된다.
이는 물론 다음 사정 때문이다.
우선 태어나기 전에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각 주체는 실재를 바탕으로 현실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망집을 일으킨다.
그러나 각 주체가 이런 사정을 미처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는 이들 내용 자체가 곧 외부의 객관적 실재라고 잘못 여긴다.
이는 앞에서 살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이 얻어낸 내용임을 이해한다.
즉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내용임을 이해한다.
그런 경우 다시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 이에 상응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고 여긴다.
그렇기에 자신이 그런 내용을 그처럼 얻게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각 현실내용에 상응 일치한 내용이 외부에 그대로 실재한다고 여긴다.
그러면 그 만큼 그 각 내용은 꿈과 달리, 실다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
즉,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사정이 다르다고 여긴다.
♥Table of Contents
▣- 다수가 일정 내용을 반복 경험하기에 그 실재가 있다고 여김
현실에서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이들은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즉, 눈을 통해 얻어낸 시각 감각내용이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그 주체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그리고 본바탕에서 그런 내용은 얻어낼 수 없다.
이런 내용은 다른 감각영역에서도 얻어낼 수 없다.
즉, 청각ㆍ후각ㆍ미각ㆍ촉각 등 감각영역에서도 얻어낼 수 없다.
그리고 관념영역 등에서도 그런 내용을 얻어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실내용 하나하나는 꿈과 성격이 같다.
즉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즉 이들 내용은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그처럼 얻어내는 것이다.
현실 각 내용의 상호간의 관계가 이와 같다.
그러나 이들 현실 내용은 정작 꿈은 아니다.
현실내용은 꿈과 다른 특성을 다음처럼 갖는다.
-- 먼저 다수가 함께 엇비슷한 내용을 얻는다.
-- 또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내용을 반복해 얻는다.
-- 또 일정한 장소 상황에서 엇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얻는다.
-- 또 일정한 관계로 일정한 조건에 일정한 내용을 결과로 반복해 얻는다.
[상속相續,시時,처處,작용作用]
일반적으로 현실내용은 이런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사정으로 현실을 대단히 실답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현실의 이런 특성은, 그 실재가 따로 그처럼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꿈과는 다르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자.
이런 경우 생사현실을 대단히 실답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전자게임이나 그림, 연극, 영화 등과 사정이 같다.
전자 게임의 화면 내용을 놓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이들 내용은 다수에게 일정하게 규칙성을 갖고 반복해 나타난다.
그렇지만, 게임 화면 내용 하나하나는 현실에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는 역시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실답지 않은 내용이다.
현실도 그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다.
한 주체는 마음에서 일정한 내용을 반복해 일정하게 얻는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다수 주체가 함께 엇비슷하게 얻는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역시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실답지 않다.
그런데도 현실 내용이 그처럼 파악된다.
따라서 그 배경사정이 무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 내용을 철수나 영희 등 제3자가 함께 엇비슷하게 얻는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만일 오로지 한 주체의 마음 영역에만 있다고 하자. [예: 공종자]
그런 경우 현실에서 함께 엇비슷한 내용을 얻는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 경우 마음 밖 본바탕 실재를 생각한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영역에 외부 실재 대상을 추리한다.
즉 그런 대상이 실재영역에 일정하게 있다고 일단 시설한다.
그리고 각 주체가 이를 함께 대한다고 추리한다.
그런데 각 주체의 감관 등의 상태가 엇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실재 대상을 각 주체가 엇비슷한 관계로 대한다.
그래서 각 주체는 각기 엇비슷한 내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재 영역의 외부 대상을 #으로 막연히 표시해보자.
그리고 이를 대하는 각 주체의 마음을 A로 표시하자.
그리고 그 주체가 얻어내는 내용을 C로 표시하자.
각 주체가 실재대상을 대한다.
그리고 제각각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이 관계는 다음이다.
# + a => C
그런데 각 주체에서 이 관계가 서로 엇비슷하다.
그래서 서로 엇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얻는다.
이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각 주체가 얻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재에서 얻을 수 없다.
즉 위 경우 C(현실)는 앞의 #(실재)에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하나하나는 모두 꿈과 성격이 같다.
즉,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관계가 같다.
따라서 실답지 않다.
그리고 현실이 실답지 않음은 바로 이 측면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 식에서 본바탕 실재 대상을 막연히 기호 #로 표시했다.
그러나 실재대상의 구체적 내용은 정작 각 주체가 얻어낼 수 없다.
따라서 본바탕 실재가 정확히 무언가가 대해 다시 다양한 논의가 있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본바탕 실재에 대한 다양한 잘못된 이해
<감각현실> 각 부분은 특성이 서로 달리 파악된다. [자신-다른 인간-생명-무생물체 등]
그리고 <감각현실>은 다수가 일정한 시기, 공간적 상황에서, 일정한 관계로 반복해 얻는다.[상속ㆍ시ㆍ처ㆍ작용]
이들 감각 현실은 이런 점에서 꿈과 다르다.
즉 현실은 꿈과 달리 이런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사정이 무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얻어진 내용 밖에서 그 사정을 찾는다.
이 경우 본바탕 실재가 무언가가 문제된다.
실재는 어떤 주체와 관계없이도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런데 그 실재가 과연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이런 가운데 본바탕 실재에 대해 유ㆍ무 양극단에 치우친 분별을 일으키기 쉽다.
우선, 다음 입장이 있다.
이들 현실 내용 일체는 마음내용이다.
그리고 마음 밖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유식학파 일부입장]
이런 경우 이는 각 주체의 마음 안에 있는 종자로 인해 그렇게 된다고 주장한다. [공종자共種子]
다만 그 종자가 다수 간에 공통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정으로 각 주체가 다 함께 엇비슷한 내용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입장은 이런 이해를 통해 현실 내용을 실답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무의 극단에 치우친 입장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실 내용을 지나치게 무시 외면하는 경향을 갖기 쉽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현실 사정을 설명하는데 여러 난점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도로 옆에 건물을 하나 세운다.
이 경우 이 건물을 거리를 지나는 다수가 보게 된다.
그런데 이를 다음처럼 해석한다.
건물을 짓는 이가 거리를 지나갈 수많은 이들의 마음안의 공종자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다수가 같은 건물을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이 된다.
이는 너무 지나친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주장은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전혀 없다고 먼저 전제한다.
그런 사정으로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뿐이다.
마음은 물론 마음 밖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본바탕 실재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본바탕 실재는 한 주체와 관계없이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런데 각 주체는 그 주체가 관계해 얻어내는 내용만 얻는다.
그래서 이런 실재는 한 주체 입장에서는 끝내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는 2분법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불이법]
즉, -이 있다, -이 없다, ~이다, 아니다, ~와 같다, 다르다 등과 같은 분별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언설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방편상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공'이란 표현을 빌려 표현하게 된다. [불가득, 공]
그런데 현실 내용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위 사실 만으로도 충분하다. [공해탈삼매]
즉, 현실내용과 실재의 차이만 이해하면 된다.
현실 내용은 각 주체가 매순간 생생하게 얻는다.
그런데 이런 현실 내용은 먼저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실재는 어떤 주체와 관계없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재는 현실내용과 달리 얻어낼 수 없다.
그리고 실재 영역에서 현실 내용을 역시 얻어낼 수 없다.
그러나 현실 내용은 이와 달리 매 순간 생생하게 얻는다.
그리고 이런 사실만으로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침대에 누워 꾸는 꿈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꿈은 실답지 않다.
이는 침대가 놓인 현실과 꿈이 서로 엉뚱하기 때문이다.
꿈 밖 현실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꿈 밖 현실에 아무것도 없어야만 꿈이 실답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즉, 꿈 밖에 침대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도 두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
즉, 현실과 꿈의 내용이 서로 엉뚱하다.
그래서 꿈을 실답지 않다고 하게 된다.
실재와 현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현실 내용은 각 주체가 생생하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실재는 '얻어낼 수 없다'.
그래서 실재는 유무분별을 떠나며, 공하다. [불가득 공]
이처럼 두 영역의 사정이 서로 차이가 난다.
이 사정만으로도 현실 내용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재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
그래서 실재가 공하다는 입장 외에도 다른 입장들이 있다.
우선 일반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이 얻은 <감각현실> 자체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일반적 입장]
그러나 현실내용은 자신이 얻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이해는 잘못이다.
이런 사정은 이미 살폈다.
그러나 현실 내용이 자신이 얻은 내용임을 인정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 다른 입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부 실재 영역에 현실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실재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한편, 실재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비례한 형태로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들은 모두 유의 극단에 치우친 입장이다. [설일체유부, 경량부]
즉, 이들은 다음 입장이다.
본바탕에 현실 내용을 얻게 된 정당한 근거가 그만큼 있다.
이처럼 여기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이런 사정으로 현실내용을 대단히 실답다고 여긴다.
그리고 각 입장에 따라 현실 내용을 실답게 여기는 정도가 달라진다.
♥Table of Contents
▣- 참된 진짜 뼈대가 있기에 현실 내용을 얻는다고 잘못 분별함 [실체설]
현실 내용에는 참된 진짜 실체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실체는 꿈과 다른 특성을 갖는 참된 진짜를 의미한다.
어떤 내용이 꿈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실답지 않음을 의미한다.
꿈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임시적으로 그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임시성]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 [조건의존성]
또 그 내용은 꿈 밖 다른 영역들에서는 얻을 수 없다.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또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에 기대하는 다른 특성도 갖추지 못한다. [가짜성품]
예를 들어 꿈에서 보는 물은 마실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 이는 가짜며, 실답지 않다고 해야 한다.
반대로 어떤 내용이 꿈과 달리, 실다운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꿈이 갖는 특성을 갖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진짜 실체는 앞과 같은 꿈의 특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 이런 참된 진짜 실체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는 현실 내용이 꿈과 달리, 실답다고 볼 내용인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 내용은 우선 각 주체별로 달리 얻는다.
그리고 시기와 상황별로 내용을 달리 얻는다.
예를 들어 바위 하나를 대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아침과 저녁에 각기 그 내용을 달리 얻는다.
그래서 각 <감각현실>은 임시적이다. [임시성]
또 각 주체는 각 감관에 의존해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감관별로 내용을 달리 얻는다. [조건의존성]
또 현실 내용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는 색은 소리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한편 이들 현실 내용은 본바탕 실재 영역에서도 역시 얻을 수 없다.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이런 사정은 이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런 사정은 이들 현실 내용이 위에서 찾는 실체가 아님도 나타낸다.
그렇지만, 또 한편 현실 내용은 또 일정한 규칙성을 띄고 일정하게 파악된다.
예를 들어 산은 산이다.
그리고 물은 물이다.
이처럼 분별할 수 있다.
매 순간 이들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현실에는 그 안에 일정한 참된 실체가 있다고 여기게끔 된다.
즉 현실 내용을 얻게 하는 참된 진짜 뼈대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현실 내용을 그처럼 일정하게 얻게 된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즉 이는 현실 내용은 뼈대가 되는 실체가 있어 그처럼 나타난다고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실체가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단 꿈과 다른 특성을 갖는 어떤 것을 관념영역에서 몽타주로 그려 내게 된다.
그리고 그 몽타주에 해당한 내용이 정말 각 영역 어딘가에 있는가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는 관념 영역에서 그런 몽타주가 있는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관념영역에서는 어떤 내용을 관념으로 그려낸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만으로 그런 관념은 관념영역에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실체의 존부는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그런 몽타주에 해당한 내용이 현실 영역에 정말 있는가 여부다.
예를 들어 관념으로 그런 진짜 실체의 관념을 구상한다고 하자.
그러면 관념 영역에서 그런 관념은 있다.
그렇다고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념에 해당한 내용이 현실 영역에 정말 있는가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참된 진짜가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관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현실 내용을 현실처럼 얻어낼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양하게 얻는다.
그리고 변화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체가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세한 논증과정은 관련된 부분에서 따로 살핀다.
그런 결과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는 없다고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논의과정에서 어떤 이가 현실에 실체가 있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사정으로 인해 현실은 꿈과 달리 대단히 실답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
생사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럼에도 현실은 위에 나열한 여러 사정으로 대단히 실답게 여기게끔 된다.
이미 이들 사정을 다양하게 살폈다.
다시 간단히 요약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 풍부하게 중첩해 현실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현실은 실답다고 여긴다.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켜 결합시킨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현실 내용을 외부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감각현실>의 각 부분의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실재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다수가, 일정 시간, 장소, 조건에서 일정 내용을 반복 경험한다. 이는 외부에 상응한 실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실답다고 여긴다.
- 본바탕 실재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를 실답다고 여긴다.
- 참된 진짜 뼈대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현실 내용을 얻는다고 잘못 분별한다. 그래서 현실이 실답다고 여긴다. [실체설]
이런 여러 사정들로 현실을 꿈과 달리 실답게 여긴다.
그런 경우 생사고통을 실답고 생생하게 받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가 겪는 생사고통은 그가 일으킨 망집의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런 생사고통을 그대로 방치하기 곤란하다.
생사고통을 받는 데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
즉 망집-업-고통의 인과관계가 있다. [혹-업-고]
근본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앞에 나열한 여러 사정들로 현실내용을 실다운 내용으로 여긴다.
즉, 이들 내용을 참된 진짜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집착을 갖는다.
특히 스스로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신견]
그런 경우 이 내용에 특히 집착을 강하게 갖는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만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일정한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런 업으로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생사고통을 실답게 겪어 나간다.
따라서 이런 망집이 생사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생사고통을 예방하고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망상분별에 바탕해 집착을 일으킨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집착의 정도에 비례해 업을 중단하기 힘들다.
한편 집착은 현실을 실답게 여기는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처럼 현실을 실답다고 잘못 여기게 하는 그 배경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현실을 실답게 여기게 하는 배경사정도 결국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사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올바로 이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잘 제거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의 목표점 [고멸제]
♥Table of Contents
▣- 근본적인 고의 제거방안 [자성청정열반, 유여의열반, 무여의열반, 무주처열반]
생사과정은 근본 무명이 그 근원이 된다.
본래 그런 생사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고통도 역시 본래는 얻을 수 없다. [자성청정열반]
그러나 어떤 이가 망집을 일으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그 바탕에서 생사현실이 그처럼 있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이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이가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러면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처음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취한다. [구생기신견]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다시 각 정신을 분화 생성시킨다.
그런 가운데 매 생을 맞이해 임하게 된다. [무명-행-식-명색-6입-...12연기]
그리고 그런 정신 구조와 기제를 바탕해서 현실을 대한다.
그런 경우 정신 표면에서 감각으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다시 자신으로 잘못 분별해 취하게 된다. [분별기신견]
그런 가운데 매순간 자신으로 여겨 취하는 내용을 죽 이어 나열한다고 하자.
그것이 생사과정에서 윤회를 겪어 나가는 과정이 된다.
한 생에서 어린아이에서 노인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매순간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것이다.
즉 어린 아이 때는 그러그러한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겨 취해 임한다.
그리고 노인이 된 때는 또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겨 취해 임한다.
이처럼 각 순간에 자신으로 잘못 여겨 취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주체의 한 생의 변화 모습들이 된다.
한 주체의 생사나 생멸은 이런 망집에 바탕한 것이다.
즉, 어리석음에 바탕해 일정부분을 처음 자신으로 취한다.
생사과정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이 근본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가 그런 망집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유여의열반
생사현실에 처해 생사고통을 받아 나간다.
그런 경우 생사 생멸의 묶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생사고통을 받는 원인이 있다.
망집 번뇌에 바탕해 업을 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그런 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으로 생사를 받게 된다.
한편 업을 행하면 업의 장애가 쌓이게 된다.
따라서 쌓인 업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한편 업은 번뇌에 바탕해 행한다.
따라서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본래 생사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망집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 생멸이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생사, 생멸을 본래 얻을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신견 등 망집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신견ㆍ변견ㆍ사견ㆍ견취견ㆍ계금취견ㆍ탐ㆍ진ㆍ치ㆍ만ㆍ의]
그런데 이들 번뇌는 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 근원과 뿌리가 깊다. [구생기 신견ㆍ구생기 변견 등]
그래서 신견ㆍ변견ㆍ탐ㆍ진ㆍ만ㆍ의 등의 근원적인 번뇌까지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번뇌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생사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해탈의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다시 생사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도 일단 한 생을 출발해 임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신체는 아직 멸하지 않고 남아 있다.
현재의 신체는 과거의 업을 통해 받게 된 내용이다.
그래서 한 생은 남은 일정 기간 유지된다.
그런 상태를 유여의열반이라고 칭한다.
♥Table of Contents
▣- 무여의열반 [회신멸지]
처음 망집에 바탕해 일정한 부분을 취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그런 주체의 생사나 생멸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이런 경우 수행을 통해 업장을 제거한다.
그리고 망집번뇌를 제거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해탈을 이룬다.
그리고 더 이상 망집을 일으켜 생사에 묶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유여의열반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남은 생의 기간 동안 머물게 된다.
이 경우 그 몸은 생을 출발한 상태에서 얻게 된 내용이다.
그런데 끝내 이런 부분까지 생사과정을 통해 제거된다고 하자.
한편 망집을 일으키게 하는 정신구조와 기제가 있다.
그런데 이후 이런 내용까지 제거한다고 하자.
그래서 가장 근본 되는 정신만 남는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이후 망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망집을 일으킬 근본이 제거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후 다시 생사에 묶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무여의열반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를 회신멸지의 상태라고도 표현한다. [회신멸지灰身滅智]
평소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래서 현실에 각 요소(5온)나 그 생멸 생사가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러나 망집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물(物)ㆍ심(心)의 속박도 사라져 없는 상태가 된다. [멸滅]
그래서 탐진치 3 독을 비롯해 온갖 번뇌의 시끄러움이 함께 사라져 없다.
그리고 본바탕 실재만 청정한 니르바나의 상태로 남아 드러나게 된다. [정靜]
그리고 3계의 온갖 근심과 고통이 사라져 얻을 수 없게 된다. [묘妙]
그리고 온갖 재액(災厄)이 사라져 여읜 상태가 된다. [리離]
생사고통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한다.
그런데 본래 본바탕 실재에서는 생사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망집에 바탕해 생사에 묶인다.
그런데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래서 본래의 청정한 니르바나 상태만 드러나 남게 된다. [이계과, 택멸, 무위열반]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곧 생사고통이 제거된 상태로 제시된다. [고멸제]
이는 비유하면, 망상에서 시작한 꿈에서 깨어나는 상태와 같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는 꿈에 들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이가 꿈을 꾸다가 깬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내용과 이를 대조한다.
그래서 꿈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꿈에 대해 다음처럼 이해하게 된다.
꿈 내용은 실답지 않다.
그래서 하나같이 쓸데없다.
예를 들어 꿈에서 바다에 빠졌어도 관계없다.
꿈에서 황금을 얻었어도 쓸데없다.
그렇다고 본래 없는 황금이 생겨나는 일이 없다.
또 꿈에서 얻었던 황금을 강도에게 뺏기거나 잃어버려도 관계없다.
그렇다고 없던 황금이 있다가 다시 없어지는 일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이가 꿈만 들면 위 사실을 다 망각한다.
그리고 또 꿈에 휘둘린다.
그러면 문제다.
그런 경우 꿈에서 깨어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수행을 통해 얻는 유여의열반, 무여의열반 의미다.
어떤 이가 꿈속에서 노력해 자신이 대하는 이들 내용이 꿈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 꿈은 다 깨지 못한 상태다.
유여의 열반이란 이런 상태와 같다.
그러다가 꿈을 마저 다 깬다.
이 상태에서는 꿈속의 것들은 모두 의미를 잃는다.
꿈에서 자신 몸이라고 잘못 여겼다.
그런데 이 역시 엉터리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꿈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알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이 역시 엉터리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들 모두 쓸데없고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즉, 꿈은 하나같이 실답지 않다.
그래서 다시는 이처럼 실답지 않은 꿈을 되풀이해 꾸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이들 내용을 모두 제거한다.
그리고 이런 꿈이 다시 발생할 근거까지 제거한다.
그래서 다시 잠이 들고 꿈을 꾸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후 그런 내용을 다시 겪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 현실을 가리던 꿈은 사라진다.
그리고 현실만 대하게 된다.
그런데 무여의열반은 이런 상태와 같다.
그래서 이를 회신멸지라고 표현한다.
다만 꿈은 비유다.
그래서 무여의열반 등과는 다른 점이 있다.
우선 꿈을 깬다.
그러면 그는 곧바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놓고 대조할 수 있다.
그래서 꿈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재와 현실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본바탕 실재는 어떤 주체와의 관계를 떠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런데 한 주체는 그 주체의 마음이 화합해 얻어낸 내용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본바탕 실재를 직접 얻어낼 도리는 없다.
그렇기에 실재의 내용을 끝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얻어 현실과 비교할 도리가 없다.
실재는 공하고 얻을 수 없다.
또 실재는 실재를 아는 일도 없다.
또한 실재는 생사고통이나 생멸을 본래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실재에서는 이런 생사고통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다.
그래서 이런 실재상태는 사실상 현실에서 헤아려 행하는 판단이다.
현실에서 이런 사정을 이해하던 않든 본바탕은 차별 없이 공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본바탕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본바탕의 사정을 이처럼 헤아려 이해한다.
그러면 현실 안에서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집착을 제거하고 생사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사정을 이해함이 갖는 의미가 크다.
♥Table of Contents
▣- 본래자성청정열반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에 묶인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열반의 상태를 얻게 된다. [택멸, 이계과, 유여의열반, 무여의열반]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행한다.
그런 경우 수행이 열반을 얻는 원인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열반은, 본래 없다가 생겨나는 어떤 상태는 아니다.
즉 수행으로 비로소 생겨나는 어떤 상태는 아니다.
열반은 본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자성청정열반]
이는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꿈에서 어떤 노력을 해 꿈을 깬다.
그러면 그 꿈 내용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현실을 맞이한다.
이 때 다음처럼 착각할 수 있다.
자신이 꿈속에서 꿈을 깨려 노력했다.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인해 현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계과, 택멸]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현실은 본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 [~자성청정열반]
어떤 이가 꿈에 들거나 않거나, 본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
자성청정 열반 상태도 이와 사정이 같다.
열반은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런 열반은 본래부터 그렇게 갖춰져 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놓인 입장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우선 수행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어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상태가 갖는 의미가 깊다.
그런 경우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반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행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
그런 경우 이런 열반 상태는 없었던 상태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이가 최면 걸린 상태와 같다.
현실에서 최면에 걸렸다가 노력해 풀려난다.
그 때 관객이 앉아 있는 객석을 비로소 의식한다.
그렇다고 그런 관객들이 최면상태에서의 노력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입장에서는 최면이 풀리는 순간 그런 현실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이다.
이것이 자성청정 열반과 유여의 열반이나, 무여의 열반과의 의미 차이다.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 안에서 '자성청정열반'에 대한 이해가 갖는 의미 - <생사 즉 열반>
본바탕 실재에서는 본래 생사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실재에서는 그런 사정으로 생사고통을 문제 삼은 적도 없다.
또 그런 사정으로 실재에서는 생사고통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다.
또 실재에서는 이런 일을 안다는 일도 없다.
그리고 어떤 주체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거나 겪지 않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주체가 이해를 하거나 않거나, 본바탕은 차별을 얻을 수 없다.
본바탕은 이에 차별 없이 본래 그런 니르바나 상태다. [자성청정열반]
본래 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각 주체가 개별적으로 망집을 일으킨다.
그러면 현실을 실답게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생사과정을 겪어 나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바탕은 이와 관계없이 니르바나 상태다.
한 주체가 생사고통을 겪거나 이를 벗어나거나, 언제나 그런 상태다.
본바탕은 그러하다.
그리고 본래 생사현실은 실답지 않다.
사정은 이와 같다.
그렇지만, 생사현실내 생사고통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본바탕은 자성청정열반의 상태다.
그래도 망집을 일으킨 주체는 생사현실을 실답게 여긴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실답게 받아나간다.
그러나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도리가 없다.
생사현실에서는 생사현실을 실답게 여기는 정도에 비례해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이런 생사고통을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근본원인인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각 주체는 수행을 통해 유여의열반, 무여의열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한 주체가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한다.
그렇다고 없었던 열반이 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체가 얻는 열반은 본래 있었던 상태다.
따라서 유여의열반, 무여의열반은 각 주체의 문제가 된다.
각 주체에게 원래의 상태를 가린 망집이 있었다.
이런 망집을 개별적으로 제거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생사고통을 겪는 입장에서는 열반이 갖는 의미가 크다.
각 주체가 생사고통을 겪거나, 열반에 이르거나 본바탕은 차별이 없다.
자성청정열반은 본래 이런 내용을 나타낸다.
그런데 생사고통을 겪는 주체가 있다.
이 경우 이런 자성청정 열반은 다음처럼 생사현실 안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망집을 일으켜 생사고통을 겪는 상태에 있다.
그런 현실 상태에서 본바탕 실재는 그런 생사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그런 사정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수행자가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현실의 본바탕이 공함을 이해한다.
즉,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이 자성청정열반 상태임을 이해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그런 깨달음과 이해가 망집을 제거하게끔 이끌어 준다.
따라서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이 자성청정열반 상태임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생사현실 안에서' 어떤 이가 그 본바탕이 자성청정열반임을 '이해'한다.
그런데 설령 그가 그런 이해를 하지 않아도 본바탕은 본래 그렇다.
그러나 그가 생사현실에서 그런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는 생사현실 안에서 그 주체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이런 이해를 통해 그는 생사현실 안에서 현실이 꿈과 성격이 같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치상 생사현실이 열반과 다르지 않음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겪는 생사고통도 평안히 임할 수 있게 된다.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이 공함을 이해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을 이런 본바탕과 대조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 진여의 측면을 99% 취해 여여하게 임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 안에서 겪는 고통도 평안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
본래 니르바나는 생사고통을 벗어난 상태다.
그런데 생사현실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상태로 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에 임하는 한 기본적인 감각과 느낌을 얻는다.
그래서 이치처럼 생사고통에 처해 평안하게 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치를 먼저 확고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수행 노력을 통해 생사고통에 처해 평안하게 임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이 곧 열반임을 현실에서 실증하는 상태가 된다. [무생법인]
그런 경우 생사현실을 굳이 벗어날 필요도 없게 된다.
본래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다.
그렇더라도 생사현실에 그대로 임해도 무방하게 된다.
그런 경우 또 생사현실 안의 무량한 선법을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생사의 묶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회신멸지의 무여열반에 든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을 모두 떠나게 된다.
그런 경우 이는 생사현실 안의 다른 선법까지도 함께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게 된다.
생사현실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 경우 처음 이런 생사고통의 제거를 원한다.
그런 경우 그는 고통만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고통과 관련 없는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경우 그 외 나머지 부분들도 결국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이들은 일체가 생사고통과 결국 관련된다.
그리고 생사현실 일체는 다 함께 망집에 바탕한 것이다.
그리고 생사현실 일체는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래서 생사현실 일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 종기를 몸에서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남겨두기를 원한다.
그런데 몸의 나머지 부분이 결국 이런 종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종기를 없애기 위해 몸 전체를 없앤다.
그러면 처음 종기만 없애려고 했던 취지와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에는 사정이 있다.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생사현실 일체가 고통에 귀결된다.
따라서 이 망집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면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가 사라진 상태가 된다.
반면, 청정한 본래의 니르바나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을 기준으로 이를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상태를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다.
즉 종기를 제거하기 위해 몸 자체까지 다 제거한 상태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를 모두 제거하여 본래의 니르바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망집 상태에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마치 종기를 없애려고 몸까지 없앤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 뿐이다.
생사현실에서 본바탕이 공하다.
그래서 본바탕에서는 생멸이나 생사고통 일체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생사현실 안에서 이해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이 꿈과 같음을 이해한다.
즉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본바탕은 공하여 얻지 못한다.
그런데 생사현실은 매 순간 생생하게 얻는다.
그리고 그런 생사현실은 실재 영역에서 얻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은 침대에 누워 꾸는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생사현실 안에서도 생사현실을 곧 열반으로 관할 수 있다.
이는 비유하면 꿈을 꾸면서 그것이 꿈임을 이해하고 꿈꾸는 상태와 같다.
어떤 이가 꿈을 꿀 때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그런데 꿈을 깨면, 그것이 실답지 않은 꿈임을 이해한다.
그런데 다시 꿈을 꾸면 그것을 잊는다.
그리고 또 악몽에 시달린다.
그런데 꿈 일체는 실답지 않고 부질없다.
그래서 꿈을 깬 다음 다시는 꿈에 들지 않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처음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가 꿈을 꾸면서 그것이 꿈임을 이해하며 꿈을 꾼다.
이 경우는 꿈이 꿈인 줄 알고 대하는 상태다.
그러면 설령 꿈을 꾸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는 꿈을 깬 상태에서 꿈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며 대하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 꿈이 어떤 내용이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냥 꿈을 꾸고 임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제 꿈 안에서 그것이 꿈임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꿈을 꾸면서 꿈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그가 그것이 꿈임을 이해한다.
그 상태에서, 침대가 놓인 현실 측면을 99% 취해 대한다.
그러면 이는 마치 꿈을 깨고 난 상태에서 꿈을 대하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생사현실도 마찬가지다.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 측면을 99% 취해 현실을 대한다.
즉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이 본래자성청정열반임을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을 대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이 침대에 누워 꾸는 꿈과 같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생사현실 안의 내용이 어떻더라도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자.
그래서 생사현실을 실답게 여긴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본래 본바탕은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
그래서 니르바나 상태다.
그럼에도 그런 니르바나 상태를 거꾸로 생사고통으로 여기고 임하게 된다.
이는 거꾸로 '열반 즉 생사'로 생사현실을 대하는 상태다.
그리고 생사현실안의 일반적인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를 본래 본바탕의 상태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즉, 우선 '<생사 즉 열반>'의 상태임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그런 측면을 취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을 대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 임하면서도 여여하게 임할 수 있다.
즉 생사고통의 묶임을 제거한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로 현실에 임하게 된다.
본바탕은 '본래자성청정열반'이다.
그런데 이 사정을 생사현실에서 확고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
따라서 생사현실에서 '본래자성청정열반'임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중생제도를 위한 방안 [무주처열반]
무주처열반은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을 제도하는 일과 관련된다.
어떤 이가 수행을 통해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을 완전히 벗어난다.
그런데 다른 중생은 여전히 생사현실에 남아 있다.
그래서 다른 중생의 제도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그가 생사현실을 완전히 벗어난다.
그런 경우 그는 이들 중생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각 주체는 각기 알아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힘들게 된다.
수행자가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
그런 경우, 수행자가 생사현실을 벗어나면 곤란하다.
그래서 중생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따라서 중생들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가 함께 임한다.
그래서 다른 중생들과 입장을 같이해 현실을 대한다.
그런 가운데 점차 다른 중생들이 꿈을 깨어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한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생사현실의 극한 고통에 당면하게 될 경우도 있다.
사정이 그렇다고 수행자가 이를 회피하면 곤란하다.
생사현실의 어떤 극한 고통에 당면해서도, 이를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행자는 자신부터 '<생사 즉 열반>'임을 잘 관해야 한다.
생사현실에 본래 생멸이나 생사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 일체의 본바탕이 청정한 열반이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런 바탕에서 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단지 이론적으로 이해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이론적 이해를 현실에 적용해 잘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생법인]
특히 생사현실에서 극한 고통에 당면할 경우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평안한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굳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생사현실에서 극한 고통에 당면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의 본바탕이 청정한 열반 상태임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취해 그 현실에서 그대로 평안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안인의 성취]
그래서 이를 위해 현실에서 망상분별에 바탕해 상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망집을 일으키는 범부 상태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불퇴전위]
수행을 통해 생사현실 일체를 모두 니르바나처럼 평안히 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완전히 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꿈에서 그것이 꿈인 것을 알고 꿈을 대하는 상태와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을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에서 이처럼 오직 본바탕 측면만 취한다고 하자.
그래서 늘 니르바나 상태처럼 머물려 한다.
그러면 또 곤란하다.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생사현실 내용이 다시 중요하다.
생사현실 안의 중생들은 생사현실 내용을 집착하고 대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런 중생과 눈높이를 일단 같이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다시 중생을 제도할 방편과 지혜를 구족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도 오직 본바탕 측면만 취하며 임하면 곤란하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본바탕과 중생의 생사현실 두 측면을 다 함께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즉, 수행자는 본바탕의 측면과 생사현실의 측면을 2중적으로 함께 취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적절히 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2중적 측면은 다음을 요구한다.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가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우선 그 자신부터 범부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집착한 상태로 머물면 곤란하다.
그리고 생사에 묶인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생사가 곧 열반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고통을 벗어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생사현실에서 그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잘 관한다.
생사현실의 본바탕에서 본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꿈과 같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사정을 잘 관한다.
그러면 이는 꿈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꿈을 꾸는 상태와 비슷하다.
그러나 만일 오로지 이것만 강조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처럼 생각하게 되기 쉽다.
즉, 생사현실은 본래 실답지 않다.
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외면해도 무방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본래 열반인 측면만을 취해 임하려 하기 쉽다.
그러나 중생은 본래 생사현실이 그런 상태임에도 망집을 일으킨다.
그러면 망집을 일으킨 정도에 비례해 생사고통을 실답게 여긴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실답게 겪어 나간다.
그래서 현실이 실답지 않다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그런 생사현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 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이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다.
또 이를 위해 생사현실에서 수행자부터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열반의 측면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단지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다는 측면에만 너무 치우쳐 머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자체를 외면하고 피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생사현실에 임해 다시 없음의 측면에만 치우치면 안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이들 현실이 실답지 않음만 관하며 생사현실을 외면해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나 열반 어디에도 집착해 머물지 않아야 한다.[無住]
그런 가운데 2중적인 측면에서 모두 좋은 상태를 얻어내야 한다.
우선 생사현실에서 본바탕의 자성청정열반의 측면을 취한다.
그리고 이 측면을 통해 생사현실 안의 생사고통과 번뇌를 모두 제거한다.
그래서 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도 잘 극복한다.
그런 가운데 다시 생사현실 안에서는 중생제도를 위해 필요한 방편을 잘 구족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생사현실에서 수행자부터 복덕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계의 덕목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시를 행한다.
그리고 이런 수행도 상에 머물지 않고 집착을 떠나야 한다. [무주상]
그래야 이들 수행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무량한 보시를 행해 나간다.
그리고 그런 수행노력으로 복덕자량을 구족하게 된다.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생사현실에서 지혜자량도 잘 구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을 다시 이롭게 해나가야 한다.
본바탕에서는 실다운 중생은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각 주체가 망집을 일으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그래서 그 사정을 함께 잘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이런 중생제도 수행도 상에 머물지 않고 집착을 떠나야 한다.[무주상]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해간다.
그래야 중생 제도의 수행이 원만하게 성취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이후 생사현실 안에서 무량한 중생을 제도해간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중생들이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중생들이 모두 열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본바탕의 측면이나 생사현실 양 측면에서 나쁨을 제거하고, 좋음을 성취한다.
그리고 수행자는 그 어느 경우에나 생사현실에 집착하지 않는다.
본바탕의 측면을 취해 온갖 생사고통과 번뇌를 제거한다.
그래서 생사에 묶이지 않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의 측면에서는 중생제도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이런 수행을 할 때에도 집착해 머묾이 없이 머문다. [무주처]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 안에서 수행을 원만히 성취한다.
그리고 양 측면에서 모두 나쁨을 제거하고 무량한 선법을 얻어낸다.
그래서 이를 무주처열반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들 [고멸도제]
각 주체가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고통스런 생사를 겪는다.
따라서 이런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멸도제는 이를 위한 수행방안이다.
생사현실에서 생사에 묶인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간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원인이 있다.
즉,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 번뇌를 일으킨다.
=> 이에 바탕해 업[의업, 구업, 신업]을 행한다.
=>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 나간다.
따라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즉,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그 뿌리가 깊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를 제거해가게 된다.
우선 망상 분별을 일단 그대로 둔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3악도의 생사고통을 벗어난다.
그래서 10선법과 같은 기초적 수행을 먼저 행한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세계를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인천교]
그래서 일단 욕계 내 3악도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여전히 생사윤회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이후 생사의 묶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비적 수행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처음 각 번뇌의 개별적 대치 방안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탐욕에는 부정관을 사용한다.
분노에는 자비관을 사용한다.
어리석음에는 인연관을 사용한다.
산란하거나 가라앉은 마음에는 수식관을 사용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집착이 많은 경우 계분별관을 사용한다.
불안 두려움 기타 장애에 처할 때는 념불관 등을 통해 극복한다. [5정심]
그리고 다시 신ㆍ수ㆍ심ㆍ법을 관한다.
그런 가운데 부정ㆍ고ㆍ무상ㆍ무아를 관한다.
이를 통해 집착을 완화시킨다. [별상념주, 총상념주]
그래서 망집 번뇌에 바탕한 업을 중단시킨다. [외범, 3현,자량위]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4제법을 관하고 닦는다.
이는 그 수행 정도에 따라 난ㆍ정ㆍ인ㆍ세제일법으로 나뉜다. [내범, 4선근,가행위]
이들은 모두 본격적 수행에 들어가기 전의 예비적 수행단계다. [7방편행(3현+4선근)]
그래서 이런 예비적 수행이 충실히 이룬다.
그러면 이제 계ㆍ정ㆍ혜 3학의 수행을 본격적으로 닦아 나갈 수 있다.
고멸도제의 내용으로 8정도 37도품 등을 기본적으로 제시한다.
이에는 계ㆍ정ㆍ혜 3학의 수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나가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본 수행
망집 번뇌는 발생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일으키게 된다.
우선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신견과 변견을 일으킨다. [구생기신견, 변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탐ㆍ만ㆍ진ㆍ치의 정서적 의지적 번뇌를 일으킨다. [탐ㆍ만ㆍ진ㆍ치]
그리고 이후 분별기에 다시 지적 번뇌를 일으킨다.
먼저 자신과 세상의 정체에 잘못된 분별을 행한다. [분별기 신견, 변견]
그리고 인과 및 수행목표와 성취방안 및 다양한 견해를 일으킨다. [사견ㆍ견취견ㆍ계금취견]
그런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의]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고통의 생사현실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원인 망집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
망집 번뇌는 발생적으로는 위에 나열한 순서가 된다.
그러나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제거가 쉬운 번뇌부터 하나씩 제거해 간다.
분별기에 이치에 미혹해 일으킨 번뇌가 있다. [이사, 견혹, 미리혹, 5 견]
이런 번뇌가 비교적 제거가 쉽다.
그래서 이런 번뇌부터 제거한다.
그 다음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번뇌가 있다. [구생기 신견, 변견, 탐ㆍ만ㆍ진ㆍ치]
이는 주로 정서적 의지적 번뇌다. [미사혹]
이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수혹]
그래서 이후 수행노력을 통해 이들 번뇌를 점차 제거해간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번뇌를 모두 제거한다.
그런 경우 결국 4제법을 통해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관해야 한다. [정견, 반야바라밀다]
그런 바탕에서 다시 정서적 의지적으로 뿌리 깊은 번뇌를 수행노력으로 끊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결국 수행방안이 된다.
그것이 곧 8정도(八正道)를 비롯한 37조도품(助道品)이다.
그리고 대승에서는 이를 6바라밀행(波羅蜜行) 또는 10바라밀행(波羅蜜行)을 제시한다.
이들은 결국 계ㆍ정ㆍ혜 3학의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런 수행방안을 닦아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고멸도제 내용이 된다.
이를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37도품
깨달음[菩提]을 성취하는 37가지 길이다.
이를 37보리분법이라고도 한다. [37보리분법菩提分法 saptatriṃśad-bodhi-pakṣikā-dharmāḥ]
이는 깨달음 즉 보리(菩提)의 일부를 이루는 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깨달음을 통해 망집번뇌를 제거한다.
그래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다.
이 37도품의 내용은 다음 구조로 되어 있다.
- 사실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 [4념처]
- 목표의 올바른 설정 [4의단]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4신족]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와 능력 [5근ㆍ 5력]
- 지혜를 얻기 위한 올바른 방안 [7각분]
- 그리고 생활 전반을 올바로 살기 위한 종합적 방안[8정도]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 각 내용 참고 『대반야바라밀다경』 제380권 68. 제공덕상품 ② K0001 V03 P0670c }
###
▼▼▼-------------------------------------------
● 다음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100~114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3장_부처님의_가르침_(0).txt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Table of Contents
▣- 4념처
이는 <4념주>라고도 한다. [4념처四念處, 4념주四念住, catvāri smṛty-upasthānāni]
먼저 <신(身)ㆍ수(受)ㆍ심(心)ㆍ법(法)>을 순서로 <따로따로> 관한다.
이를 <별상념처관>(別相念處觀)이라 한다.
1 신(身: 몸)- 몸의 <깨끗하지 않음>을 관한다.
2 수(受: 감수) - 느낌을 <괴로움>으로 관한다.
3 심(心: 마음) - 마음현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관한다.
4 법(法: 그 외 나머지 현상) - 법 즉 현실의 일반현상을 잘 관찰하여 이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아我]가 없음을 관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총합하여 관한다.
이를 <총상념처관>(總相念處觀)이라 한다.
즉, <신ㆍ수ㆍ심ㆍ법 >일체가 모두 <부정ㆍ고ㆍ무상ㆍ무아>임을 관한다.
몸의 <깨끗하지 못함>[부정]ㆍ느낌의 <고통>ㆍ마음의 <무상함>을 관한다고 하자.
그러면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음[무아]를 관한다고 하자.
여기서 법은 현실의 일반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면 <집착>도 제거하고, 또한 근본적인 <망상분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현실에서 <가치>와 <사실>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때 얻게 되는 결론적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 날수 있다.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다른 주체와 가해 피해관계를 만드는 <업>을 행해 가게 된다.
이 <업>은 탐욕, 분노의 <번뇌>에 바탕해 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욕계의 <생사고통>을 받아 나가게 된다.
이를 <번뇌[혹]- 업 - 고>의 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4념처는 생사고통을 받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수행이 된다.
이러한 4념처는 <예비 수행단계>에도 들어 있다.
즉 <3현이라는 예비 수행과정>에도 별상념주, 총상념주로 제시 된다. [3현]
그리고 <37 조도품이라는 본 수행>에서도 이는 역시 중요하다.
한편 <삼매>에서도 닦아 나갈 중요한 <기본 주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4정단
이는 <4정근>이라고도 한다. [4정단四正斷, 4정근四正勤, catvāri prahāṇāni]
1. 이미 일어난 <악>(惡)을 끊는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행한다. [단단斷斷]
2. 아직 일어나지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계율과 위의(威儀)로써 부지런히 행한다. [율의단律儀斷]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善)은 생겨나게 한다. 그래서 정도(正道)를 따라 부지런히 행한다. [수호단隨護斷]
4. 이미 일어난 <선>(善)은 더욱 키운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행한다. [수단修斷]
이런 4 의단은 <계율>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행하는 수행자가 <생사현실>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할 목표 내용이 된다.
4의단 수행방안이 제시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수행자가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수행자 자신부터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업의 장애>를 쌓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악업>을 끊고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각 생명은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 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등을 대단히 <집착>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망집>에 바탕해 <소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이들 내용을 함부로 <침해>한다.
그로 인해 서로 <가해 - 피해관계>가 중첩해 쌓이게 된다.
그러면 그 <업>으로 인해 <생사고통>에 처하게 된다. [혹-업-고]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이런 <악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행자는 먼저 현실각 내용의 <가치>를 잘 비교하고 헤아려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소원 대부분은 <가치>가 적음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 수행자가 올바로 현실의 <본 정체>를 파악한다고 하자.
그리고 <무상삼매>를 잘 닦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여기는 상태>에는 본래 <그런 내용> 자체를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무상삼매해탈]
그래서 이들 내용 일체는 <망집>에 바탕해 일으킨 내용임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쓸데없는 <소원>은 다 남김없이 제거한다. [무원무작삼매해탈]
그런 가운데 기존에 행한 <악>은 더 키우지 않는다. [단단斷斷]
또한 새로운 <악>은 새로 일으겨 행하지 않아야 한다. [율의단律儀斷]
한편 이미 그런 업을 행해, <업의 장애>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하자.
이런 경우 그 <업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수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산성> 염산을 바닥에 부어 놓았다고 하자.
그런 경우 과거로 돌아가 이것을 되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후 그와 반대되는 <알칼리성> 양잿물을 그만큼 붓는다.
그러면 과거의 <산>과 <알칼리>가 합해져 물이 된다.
<수행>도 마치 이와 같다.
과거에 행한 <업장>이 쌓여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먼저 앞의 <단단> <율의단> 수행을 행한다.
그래서 악업을 끊어 더 이상 업장이 계속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
그리고 <이미 쌓여 있는 업장>을 다시 <제거>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행한 악업과 반대되는 <선행>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쌓여진 업장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단단><율의단>수행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악업을 행하게 되는 <소원>을 남김없이 제거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이후 대신 <올바른 서원>을 일으켜 채워 넣는다.
즉 망집을 없애고자 하는 <서원>을 일으킨다 .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른 이도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끌려는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선업을 일으켜 행하고자 하는 <서원>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죽음에 처한 생명을 돕고 살린다.[방생]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이의 생계를 돕는다.
그리고 생명들에게 널리 좋음을 널리 끊임없이 베푼다.
즉, 올바른 선과 지혜, 즐거움과 이익을 베푼다. [보시]
그러면 이런 <선업>으로 과거에 쌓아 놓은 <업장>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은행 계좌와 사정이 같다.
처음 잔고에 <부채>만 있었다.
그런데 꾸준히 저금을 하다.
그러면 이후 <부채>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후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선업>을 닦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업>을 닦는다. [수호단隨護斷]
그리고 이미 있는 선은 꾸준히 키워 나간다. [수단修斷]
그러면 처음 쌓여진 <업장>이 제거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꾸준히 행한다.
그러면 쌓여 있던 <업장>이 다 제거된다.
그러면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일단 풀려나게 된다.
그 이후로도 이를 꾸준히 행한다.
그러면 다시 <복덕자량>이 쌓이게 된다.
이후 <복덕자량>이 점차로 원만하게 되며
자기의 지혜로 하여금 또한 더욱 더 자라게 하여 <지혜자량>이 점차로 원만하게 된다.
{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50권 (K0570 v15, p.891b) }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덕자량>이 쌓이지 않게 된다.
<복덕자량>이 쌓이지 않은 상태라고 하자.
그 대표적 경우로 현실에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가 곤란한 정도의 <빈곤>, <질병>, <노예처럼 낮은 지위, 신분>, <감옥에 갇힌 상태 >등이 이런 경우다.
그리고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또는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서 <망집>을 일으켜 <가치가 적고 쓸모 없는 일>에 묶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하루 종일 <가치적고 쓸모 없는 일>만 붙들고 정신없이 바쁘게 행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 그런 상태에서는 <정려>나 <지혜>를 닦기 힘들게 된다.
그러면 <지혜자량>을 닦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선업>을 행한다.
그러면 <복덕자량>이 쌓인다.
그러면 이후 <지혜 자량>을 닦아나갈 바탕이 마련된다.
그러면 이를 통해 <근본 무명 번뇌>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사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는 스스로 이런 <4의단>의 수행을 잘 성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도 함께 그처럼 행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 전체가 곧 수행자가 현실에서 추구할 <수행목표>가 된다.
그리고 수행자의 <서원> 내용이 된다.
그리고 특히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하는 보살 수행자라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꾸준히 생사현실에서 닦아야 할 <정계바라밀다> 및 <정진바라밀다>의 주된 내용도 된다.
이 가운데 정진 바라밀다는 모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행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생제도 수행은 모든 게으름ㆍ악(惡)ㆍ불선법을 멀리 여의고, 한량없는 선법을 생겨나게 하고 그것들을 늘리는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4의단이 정진바라밀다의 주된 내용이 된다.
{ 참조 『대반야바라밀다경』 제51권 v01 p447c }
{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K0592 v16 P1302a }
♥Table of Contents
▣- 4여의족
4여의족은욕(欲 희망)ㆍ정진(精進 노력)ㆍ념(念, 심心 기억)ㆍ혜(慧, 사유思惟 지혜)의 넷을 든다.
일반 현실을 놓고 생각해보자.
어떤 이가 <소원>이 아예 없다.
그런데 어떤 좋은 상태가 저절로 성취돼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좋은 상태>를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먼저 그에 대해 <소원>을 일으켜 가져야 한다.
=>욕(欲 희망)
한편 그런 소원을 일으켜 갖는다.
이런 경우 이를 <성취할 방안>을 미리 다 알면 편할 것이다.
이미 많은 이가 경험해 그에 관련되어 정리된 내용이 쌓여 있다.
그런 경우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의 <간접경험>을 취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지도>와 같다.
처음 탐험가가 수차례 탐험을 해서 지도를 그려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가 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보고 쉽게 길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각 부분마다 그런 내용이 모두 미리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에 그런 <지도>와 같은 내용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도 늘 지도와 같은 내용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러면 목적을 성취하기 곤란하다.
그런 생태에서 어떤 <실천 노력>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그런 경우는 자신이 직접 탐험가 입장으로 임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목표에 가깝게 보이는 방향>을 찾는다.
그리고 일단 그런 내용부터 <실천>한다.
그리고 그 <노력>을 꾸준히 행해간다.
=> 정진(精進 노력)
이런 노력을 꾸준히 행해 간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 노력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그에 관련된 경험이 쌓인다.
그러나 이런 노력 실천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 되풀이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경험을 쌓으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기억>한다.
=> 념(念, 심心 기억)
그러면 이런 경험의 축정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자신이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도 있다.
=> 혜(慧, 사유思惟 지혜)
<일반 현실>에서 소원을 성취하려 한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한다.
이런 경우 미리 만들어진 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지도를 보고 잘 찾아가면 된다.
그런데 그런 지도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탐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길을 나서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목적지에 가까오 방향을 향해 노력해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경험을 하는 동안 경험한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계속 반복해 헤매 돌게 된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끝내 좋은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도를 잘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 지도를 통해 원하는 상태를 잘 찾아 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처럼 뜻을 잘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신통>하다고 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요소가 결국 뜻을 <신통>하게 잘 <성취하게 하는 방안>이 된다.
<수행>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실에서 <망상분별>에 바탕해 소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 고통>을 받아 나가게 된다. [혹-업-고]
그래서 수행자는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한 쓸데없는 소원>은 모두 제거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업>을 중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고통>을 제거 예방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더 나아가 <다른 중생>들도 그처럼 이끈다.
그러기 위해 또 생사현실에서 <복덕>과 <지혜>를 갖춘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법신>을 증득해 <성불>한다
그리고 중생을 모두 이런 생태로 이끌어 <중생 제도>를 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수행자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런 목표를 현실에서 잘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한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실천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각 내용을 마음에 <념>해 잘 기억하고, 마음에 떠올려 오래 머물게 한다.
그리고 <지혜>를 갖춘다.
그리고 이런 방편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삼매>를 잘 성취하고 뛰어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서원한 목표를 뜻처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내용이 결국 수행목표를 잘 이루는 방안이 된다.
4여의족(四如意足)은 4신족(四神足)이라고도 한다.
범어로는 catvāra-ṛddhipādāḥ라고 한다.
여의족에서 <여의>는 뜻대로 자유자재한 <신통>을 뜻한다.
<족>은 걸어가는데 사용하는 발을 뜻한다.
그래서 이런 신통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욕(慾 )은 수행으로 결과를 증득하고자 하는 <서원>을 의미한다.
한편 정진(精進)은 악을 그치고 <선>을 <끊임없이 닦아 나감>을 의미한다.
념(念)은 일정한 내용을 마음에 떠올려 머물게 하여 <집중함>을 의미한다.
혜(慧)는 실상을 꿰뚫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치를 헤아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삼매[定]를 일으키고 또한 뛰어난 힘을 이끌어낸다.
[대비바사론 권141]
그리고 이에 의해 다음처럼 삼매를 나눈다
[욕欲 삼마지 단행성취신족 三摩地斷行成就神足, chanda -samādhi-prahāṇa-saṃskāra-samannāgata-ṛddhi-pāda]
[근勤 삼마지 단행성취신족 三摩地斷行成就神足, vīya -samādhi-prahāṇa-samannāgata-ṛddhi-pāda]
[심心 삼마지 단행성취신족 三摩地斷行成就神足, citta-samādhi-prahāṇa-saṃskāra-samannāgata-ṛddhi-pāda]
[관觀 삼마지 단행성취신족 三摩地斷行成就神足, vīmāṃsā-samādhi-prahāṇa-saṃskāra-samannāgata-ṛddhi-pāda]
그리고 이는 삼매와 지혜를 균등히 하여 서원을 성취하게 해준다.
예비 수행단계에서는 이는 4선근위의 정위[頂位]와 관련된다.
[참조 구사론 권25]
♥Table of Contents
▣- 5근
<망집 번뇌>를 일으켜 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에 바탕해 다른 생명과 피해를 주고 받는 <업>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사고통>을 받아나가고 <생사>에 묶이게 된다.
그래서 <망집번뇌8는 <생사묶임>의 <근본원인8이 된다.
따라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근본적으로 <망집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망집 번뇌>에 물든 마음을 <염오심>(染污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염오심>(染污心)과 언제나 함께 따르게 되는 <번뇌>가 있다.
▪ 올바른 가르침을 믿지 않고 의심함[不信불신]
▪ 수행에 임해 게으름 [懈怠해태]
▪ 수행을 방치하고 하지 않음 [放逸방일]
▪ 마음이 어둡고 흐려 혼미하고, 가라앉아 답답하고 침울함 [惛沈혼침]
▪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들뜸 [掉擧도거]
▪ 마음이 여러갈래로 산만하고 어지러움 [散亂 산란]
▪ 기억할 일을 기억하지 못함 [失念실념]
▪ 올바르지 못한 지식 [不正知부정지] 등이다.
이들은 <염오심>(染污心)과 언제나 함께 따르는 번뇌이다.
그래서 이를 <대번뇌지법> 또는 <대수혹>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망집>을 제거하려면 먼저 이런 여러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ㆍ법ㆍ승> 3 보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자.
그런 경우 올바른 가르침에도 <의심>을 갖고 주저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파악한 후에 행하려 한다.
그러면 <수행>을 끝내 실천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
어떤 이가 생사현실의 <정체>나 <인과>를 낱낱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래도 먼저 생사현실의 <정체>나 <인과>에 대한 <올바른 스승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바로 <수행>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수행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해 <증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는 <불신>(不信)을 제거한다. => [신근信根]
나머지도 이와 사정이 같다.
<해야 할 수행>이 a라고 하자.
그래서 그런 a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해 행하지 않는 것>을 해태(懈怠)라고 한다.
한편, 그런 수행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방탕하게 임하는 것>을 <방일>(放逸)이라고 한다.
이런 번뇌가 있는 상태면, <수행>을 성취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해야할 수행> 가운데 가장 <쉽고 간단한 일>부터 무조건 하나 붙잡고 시작한다.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노력해 닦아 나간다.
그런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선>을 닦아 나간다. 즉, 4정근을 열심히 닦아 나간다.
이렇게 행하면, <해태>(懈怠), <방일>(放逸)의 번뇌를 제거하게 된다. => [진근進根]
한편 수행을 통해 <익힌 내용>을 평소 생활에서 매번 잊고 지낸다고 하자.
또 마음이 산란하여 정확하게 기억해 내지 못한다고 하자.
이런 상태를 <실념>(失念)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마음에는 매 순간 자신을 자극하는 <가치없는 내용>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쓸모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이에 얽혀 <업>을 행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 <가치있는 목표>나 <그 실천 방안>은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마음에 늘 <가치있는 목표>나 <그 실천방안>이 떠올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해당 내용을 <실천>해갈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수행을 통해 익힌 내용>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마음에 떠올려 늘 머물게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내용을 대할 때 이를 <수행>과 관련시킨다.
그래서 관련된 <수행항목>을 떠올리려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소 수행항목을 익힐 때 평소 대하는 사물과 관련시켜 기억해 두려 노력한다.
이런 방식이 <수행항목>의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 => <마음을 닦고 깨끗이 하는 수행>의 필요성
식사 => 음식물과 같이 필요한 것을 다른 이에게 <보시>함
옷 => 옷과 같이 청정하고 깨끗하게 <계율>을 지킴
세면대 =>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면하듯, <안인>수행을 함
책상, 의자 => 책상 의자에 앉아 학습하듯, <정진> 수행을 함
소파 침대 => 소파에 앉아 편하게 쉬듯, <정려>수행을 함
시계 => <반야> 지혜의 수행
이런 식으로 <평소 자주 대하거나 행하는 일>에 <수행행목>을 관련시켜 기억해 둔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들 내용을 대하거나 행할 때 관련된 <수행항목>을 떠올린다.
그러면 <수행 항목>을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해 나가는 데 도움된다.
한편, 수행항목은 <법수>로 된 항목이 많다.
4념처, 4정근, 5근, 5력 등과 같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서 어떤 <숫자>를 대할 때마다 해당 항목을 떠올리려 노력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모든 <사물>을 <수>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수행 항목을 떠올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된다.
이처럼 <평소 익힌 내용>을 나중에 연상이 잘 되도록 평소 기억하고 지니려 노력한다.
한편 <기억할 내용>이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들 내용을 <감각>을 동원해 <이야기>가 잘 되도록 결합시키는 것도 기억에 도움된다.
이런 경우 관련 내용이 <연상>이 잘 되게 된다.
이렇게 행하면, <실념>(失念)의 번뇌를 제거하게 된다. => [념근念根]
한편, 수행할 내용이 마음에 떠올라 머문다고 하자.
그렇다해도 마음이 <어둡고 흐린 상태>라고 하자.
또는 마음이 <가라앉아 침울한 상태>라고 하자.
이런 상태를 <혼침>(惛沈)이라고 칭한다.
한편 공연히 <마음이 들떠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자.
이를 <도거>(掉擧)라고 칭한다.
또는 마음이 자극받는대로 여러갈래로 <산만하고 어지러운 상태>라고 하자.
이를 <산란>(散亂)이라고 칭한다.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는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을 <집중>해 행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마음을 현실 내용의 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
<호흡>을 하는 일은 어느 경우나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호흡을 하는 가운데 호흡에 초점을 맞추고 <들숨> <날숨>을 센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집중>한다.
그런 가운데 다시 <수행항목>을 떠올려 이들 내용을 생각해나간다.
그러면 <삼매>의 상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혼침(惛沈), 도거(掉擧), 산란(散亂)의 번뇌를 제거한다. => [정근定根]
한편 마음을 <하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고 하자.
그러면 <삼매> 상태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현실의 정체>를 <실상>을 꿰뚫어 깊게 관한다.
그리면 실상이 <공>한 이치를 곧 알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정지>(不正知)의 번뇌를 제거한다. => [혜근慧根].
그리고 이런 요소를 통해 <깨달음>의 과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아가 <탐ㆍ진ㆍ만ㆍ무명 어리석음> 등의 근본 번뇌를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잘못된 <망집>을 제거 하려 한다.
그리고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는 마치 현실에서 <길을 잘 모르는 이>가 처음 <산 너머 마을>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경우 어떤 이가 다음처럼 자세를 취한다고 하자.
즉, 산에 오르기 전에는 미리 자신이 <산 너머 모습>을 낱낱이 알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 경우 자신이 <미리 알지 못한 내용>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래서 늘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산을 올라가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내용>은 일체 행할 도리가 없게 된다.
그런 가운데 <길을 알려주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노력>이나 <지혜 >등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끝내 산을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산 너머 모습도 끝내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길을 아는 어떤 이>가 자신에게 길을 알려준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믿음>을 갖고 따른다. => [신근信根]
그리고 이후 산을 올라가는 <노력>을 실천한다. => [진근進根]
그리고 험한 산길에서 목표지와 길을 잘 <기억>해 헤매지 않는다. => [념근念根]
그래서 길을 가며 <집중>한다. => [정근定根]
또 <지혜>를 갖춘다. => [혜근慧根].
그러면 산에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산을 다 오른다.
그러면 뜻을 <성취>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된다.
그 전까지는 <산 너머 마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처럼 성취하면 <산너머 마을 모습>을 직접 대하고 볼 수 있게 된다.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수행>도 사정이 같다.
결국 이들은 올바른 목표의 <성취>를 하게 한다.
그런 <뛰어난 작용>을 갖는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게 도와주는 기초요소가 된다.
『잡아함경』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근이 있다.
이른바 신근(信根)ㆍ정진근(精進根)ㆍ염근(念根)ㆍ정근(定根)ㆍ혜근(慧根)이다.
신근이란 마땅히 4불괴정(不壞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진근이란 4정단(正斷)임을 알아야 한다.
염근이란 4념처(念處)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정근이란 4선(禪)임을 알아야 한다.
혜근이란 4성제(聖諦)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 K0650v18p0959a15L; 잡아함경『雜阿含經』 제26권 646. 당지경(當知經) }
결국 수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 먼저 불ㆍ법ㆍ승 3보 및 그 가르침과 인과를 <믿음>으로 대한다.
이를 통해 불신(不信)을 제거한다. => [신근信根, 믿음, śraddhendriya)
▪ 그 다음 용맹하게 수행을 시작하고, 꾸준히 악을 제거하고 선을 닦아 나가는 <노력>을 행한다.
이를 통해 해태(懈怠) 방일(放逸)을 제거한다. => [진근進根, 노력, vīyendriya)
▪ 그 다음 올바른 진리를 잘 <기억>해 지닌다.
이를 통해 실념(失念)을 제거한다. => [념근念根, 기억, smṛtīndriya)
▪ 또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산란하게 임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혼침(惛沈)ㆍ도거(掉擧)ㆍ산란(散亂)을 제거한다.=> [정근定根, 삼매, samādhīndriya)
▪ 그리고 현실의 정체를 실상을 꿰뚫어 깊은 <지혜>로 관한다.
이를 통해 부정지(不正知)를 제거한다. =>[혜근慧根, 지혜, prajñendriya)
이들은 번뇌를 항복시킨다.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에 나아가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작용을 갖는다.
이 가운데 진(進) 념(念) 혜(慧) 등의 항목은 이미 <4 여의족>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은 번뇌를 누른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함에 특별히 뛰어난 작용을 갖는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5근>에 넣는다. [오근五根 pañcendriyāṇi]
여기서 근(根)은 최승(最勝)ㆍ자재(自在)ㆍ증상(增上)의 뜻이다.
즉, <그 작용이 우수한 것>을 나타낸다.
5감관을 육체에서 다른 부분과 구별해 5근이라고 한다.
이 경우도 사정이 같다.
그리고 이들은 다 함께 <22근>에 포함된다.
이는 일체 법 중에서 작용(作用)이 가장 수승(殊勝)한 22법이다.
22근을 함께 나열할 경우 <5근>은 <5선근>이라 표현한다.
22근은 참고로 다음 내용들이다.
▪ 6근(根): 몸을 기르고 정신내용을 낳는 <수승한 감각 인식기관 >
안(眼: 눈), 이(耳: 귀), 비(鼻: 코), 설(舌: 혀), 신(身: 몸), 의(意 )
▪ 3근(根): 일반인에서 <형상, 음색, 생활 전반에 수승한 작용>을 함
남(男), 여(女), 명(命)
▪ 5수근(受根): 탐진치 등 번뇌[수면]에 작용하는 <수승한 느낌>
고(苦-괴로움), 낙(樂-즐거움), 우(憂-근심), 희(喜-기쁨), 사(捨-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 5선근(善根): <청정한 법에 수승한 작용>을 함
신(信: 믿음), 근(勤: 노력), 념(念: 기억), 정(定: 집중), 혜(慧: 지혜)
▪ 3무루근(無漏根): 번뇌를 낳지 않고, 지적 정서적 번뇌를 모두 끊고 <열반에 이르게 함에 수승한 작용>을 함
여기에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 이지근(已知根), 구지근(具知根)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다시 수행자의 다음 9근과 관련된다.
이 9근은 의(意)ㆍ낙(樂)ㆍ희(喜)ㆍ사(捨)ㆍ 신(信)ㆍ근(勤)ㆍ염(念)ㆍ정(定)ㆍ혜(慧) 를 말한다.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
이는 수행자가 <견도>(見道)의 지위에 있을 때의 9근을 말한다.
즉, 견도위에 있는 수행자는 일찍 알지 못하던 [未知] 4제의 이치를 제16심에서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래서, 견도위의 수행자가 4제(四諦)를 알게 하며 <지적번뇌를 제거함에 수승한 작용>을 갖는 9근을 말한다.
▪▪이지근(已知根)
이는 수행자가 <수도>(修道)에 있을 때의 9근을 말한다.
이미 견도위에서 4제(四諦)를 알고, 지혜로써 미혹함[迷]ㆍ깨달음[悟]ㆍ인(因)ㆍ과(果)의 도리를 다 알게 된다.
그렇다해도, 삶을 유지하는 한, 생래적 정서적 번뇌는 남아 있다. [구생기번뇌]
그래서 이런 번뇌를 끊기 위해 수행을 닦아 나가게 된다.
이를 수도(修道)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지위에서, < 생래적 정서적 번뇌를 끊어 나감에 수승한 작용>을 갖는 9근을 말한다.
▪▪구지근(具知根)
수행자가 <무학도>(無學道)에 있을 때의 9근을 말한다.
무학도(無學道)에서는 닦을 것은 모두 닦고, 끊을 번뇌도 모두 끊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열반>을 증득하여 아라한위(位)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라한은 무루지(無漏智)를 갖춘다.
이런 지위에서, 모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함에 수승한 작용>을 갖는 9근을 말한다.
[俱舍論 卷3 ㆍ大毘婆沙論 卷142]
♥Table of Contents
▣- 5력
<5력>은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5가지 힘>이다. [오력五力, pañca balāni]
이들 내용은 <5근>에 의해 생겨나고 늘어난 역량을 뜻한다.
그래서 수행을 유지하고 해탈에 이르게 해준다.
그래서 뛰어난 작용을 갖는다.
먼저 불법승 3보 및 그 가르침과 인과를 <믿는 힘>이 있다.
이런 힘은 잘못되고 삿된 믿음을 제거한다.
그리고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신력信力, 믿음의 힘, śraddhā-bala]
그 다음 용맹하게 악을 제거하고 선을<노력해 닦아 나가는 힘>이 있다.
이는 곧 4정근을 닦는 힘이다. [정진력精進力, 노력의 힘, vīrya-bala]
그 다음 올바른 진리를 잘 <기억해 지니는 힘>이 있다.
이는 4념처와 관련된다. [념력念力, 기억의 힘, smriti-bala]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수승한 힘을 끌어낸다.
그리고 번뇌가 사라진 적정한 상태에 이른다. [정력定力, 삼매의 힘, samādhi-bala]
그리고 4제법을 닦고 현실의 정체를 <실상을 꿰뚫어 관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보리를 성취한다.
그리고 해탈을 얻게 한다. [혜력慧力, prajñā-bala]
5근과 5력은 모두 <순서>대로 점차 닦는 형태로 되어 있다.
5근과 5력은 그 실질 내용이 같은 동체다.
다만 다음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행자가 처음 <서원>을 일으켜 수행한다.
이 경우 아직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
그런데 5가지 내용을 닦는다.
그러면 이제 그 <각 기초>가 확립된다.
그래서 이후 뛰어난 작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처음 <5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5가지 요소가 행해진다.
그래서 번뇌를 무너뜨리는 <뛰어난 역량>을 보이게 된다.
이를 <5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5근>은 아직 초보인 상태[鈍根者]에서 닦는 내용이다.
그리고 <5력>은 <좀 더 뛰어난 상태>에서 닦는 내용이 된다.
이들은 5근과 함께 <올바른 목표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기초요소>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7각지
이는 <7각분>이라고도 한다.
[칠각지七覺支, 칠각분七覺分, sapta-saṁbodhyaṅga / saptabodhyaṅgāni]
여기서 <각>(覺)은 <깨달음>, 보리(菩提) 지혜를 뜻한다.
7가지 내용은 올바른 지혜를 얻도록 돕는다.
그리고 해탈 열반을 얻도록 돕는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그리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떠올려 마음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이를 <기억해 지닌다>.
[념각지念覺支, 기억 smṛti-saṁbodhyaṅga] .
그리고 지혜로써 <각 내용을 택해 관찰>한다.
그리고 또 그 진위 선악을 간별한다.
그래서 참되고 선한 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법은 버린다.
[택법각지擇法覺支, 선택 dharma-pravicaya-saṁbodhyaṅga]
그리고 게으름과 방일을 떠난다.
그리고 참되고 선한 법을 닦는다.
그리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닦아 나간다>.
[정진각지(精進覺支, 노력 vīrya-saṁbodhyaṅga]
참된 진리와 선한 법을 얻는다.
그리고 <환희심>에 차 기뻐한다.
[희각지喜覺支: 기쁨 prīti-saṁbodhyaṅga]
잘못된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고 평안 안온>하게 한다.
[경안각지輕安覺支, 심신의 경쾌안온함, 제각지除覺支 의각지猗覺支 praśrabdhi-saṁbodhyaṅga ]
산란함과 들뜸 가라앉음을 떠난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삼매를 닦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망상분별과 번뇌를 제거한다.
[정각지定覺支, 삼매 samādhi-saṁbodhyaṅga]
집착을 여읜다.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내용을 버린다.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내용을 쫒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한쪽에 치우쳐 기울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평등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한다.
[사각지捨覺支, 평정 upekṣā-saṁbodhyaṅga]
이 가운데 <념각지>는 <정>과 <혜>를 겸한다.
따라서 삼매와 지혜를 균등히 닦음에 도움 된다.
그리고 <택법, 정진, 희각지>는 <혜>(慧)의 작용에 속한다.
따라서 마음이 어둡고 가라앉는다고 하자.[혼침]
그런 경우는 택법, 정진, 희각지가 도움이 된다.
한편, <경안, 정, 사각지>는 <삼매>[定]의 작용에 속한다.
따라서 마음이 들떠 흔들린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경안, 정, 사각지가 도움이 된다.
결국 위에 나열된 <7가지 요소>는 <실상>을 꿰뚫어 <올바른 지혜>를 얻게 해주는 방안이다.
♥Table of Contents
▣- 8정도
8정도는 8 성도라고도 한다.
[8정도八正道, 8성도八聖道, ārya-aṣṭāṅgika-mārga]
한 주체가 생활하는 가운데 행하는 온갖 행위가 있다.
이 가운데 <수행>에 의미 있는 내용을 8가지를 세운다.
그리고 이 각 내용을 모두 올바르게 잘 행해야 한다.
그래서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망상분별>과 <번뇌>를 제거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번뇌>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행>을 한다.
이런 경우 <그 수행>은 극단적 <두 변>을 떠나야 한다.
즉, 지나치게 <안락한 상태>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스런 상태>도 피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가장 좋은 <수행결과>를 얻어내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이는 거문고와 같은 악기의 줄과 같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두 극단>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 좋은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상태>를 다시 잘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석존은 처음 <법륜>을 펼칠 때 중도(中道)를 실천해야 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곧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했다.
그런 가운데 <8정도>를 나열한다.
이 8정도는 4제법에서 <도제>(道諦)의 핵심이 된다.
8정도의 각 항목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닦아야 할 내용은 아니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8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of Contents
▣- <정견>(正見)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런 경우 <세상>과 <자신>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진리>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정견正見 samyag-dṛṣṛi]
한 주체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망상분별>에 바탕해 <업을 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아나가게 된다.
따라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망상분별>을 제거해야 한다.
한 주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내용을 <분별 판단>한다.
한 주체가 판단하는 내용에는 크게 다음 부분이 있다.
우선 <세상>과 <자신>의 <본 정체>를 판단한다. [정체 성품 사실판단]
그리고 그 <발생>과 <소멸>에 관해 <인과>를 판단한다. [인과 사실판단]
또 각 내용에 대해 <좋고 나쁨>의 <가치>를 판단한다. [가치판단]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는 원인 <방안>을 판단한다. [목표와 실현방안]
그런 가운데 <행위>를 해나간다.
그런데 한 주체가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런 경우 한 주체가 <업>을 행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정한 판단>이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판단>들이 특히 문제된다.
이런 측면에서 <잘못된 견해>를 크게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즉 <신견>, <변견>, <견취견>, <사견>, <계금취견>이다. [5견]
먼저 한 주체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집착>한다.
그리고 이후 <모든 집착>은 이에 바탕해 일으킨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가장 문제된다. [신견]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과정에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자신에 대해 <집착>을 갖는다.
이련 경우 그 자신이 <사후> 계속 존재하는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있고 없음>, <영원함>, <단멸함> 등의 판단이 문제된다. [변견; 단견, 상견]
이는 한 주체가 고려하는 <기간>과 관련된다.
그리고 <삶에서 인과를 판단하는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삶에서 <구체적 목표>를 선택 결정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성취 방안>을 선택함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짧게> 한 생만 고려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길게> 후생까지 고려한다.
이런 경우 이들은 대부분 <정반대 방향>으로 결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한 주체의 <선택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의 판단이 잘못 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서 매 경우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를 <잘못된 방안>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사고통>을 심하게 겪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한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이런 세상의 내용은 무량하다.
그리고 그 각각에 살필 내용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성품, 모습, 전체와 부분의 구조, 본체, 다른 것들과의 관계, 힘, 작용, 원인, 결과, 효과, 시간상 변화과정 등>이 다 문제된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 <수많은 잘못된 판단>을 일으킬 수 있다. [견취견]
다만 이들은 <자신>과 관련될 경우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런 가운데 견해를 내세워 고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한다.
그런 가운데 다투기 쉽다.
한편, 현실 내용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소멸한다.
이 과정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인과의 이해는 <현실의 본 정체>를 이해함에도 중요하다.
한편 <인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무상, 고, 무아, 공> 등의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과>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 [사견]
그러면 <현실>의 <본 정체>를 파악함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또 매 경우 잘못된 형태로 <삶>에 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연론>, <무인론>이나, <숙명론>을 취한다.
그런 경우 <삶>에서 <수행 노력>이 필요 없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한편 한 주체가 자신의 <삶>에서 <좋은 상태>를 성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인과 판단>에 바탕해 성취 방안을 찾게 된다.
이는 결국 <목표>의 성취와 관련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수행목표>의 <성취 방안>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를 <잘못 판단>한다고 하자. [계금취견]
그러면 <엉뚱한 목표>를 위해 <엉뚱한 행위>를 고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못에 앉아 <주문>을 외우면, 후생에 <하늘>에 태어난다고 믿는다.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 그런 <엉뚱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 경우 <그가 원하는 상태>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견해>가 문제된다.
그런 <잘못된 견해>는 <엉뚱하고 잘못된 업>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처럼 <잘못된 망상분별>이 다양하다.
이런 경우 이런 망상분별에 바탕해 <집착>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견해>는 <올바른 이치의 이해>로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세상에서 살펴야 할 <주제>나 <범위>가 무한하다.
따라서 올바른 이해를 하려 할 경우 <그 순서>나 <범위>가 중요하다.
현실에서 <고통>의 제거가 가장 문제된다.
그래서 <고통>을 다 제거한다.
그 경우 나머지로 <좋은 상태>, 또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상태>만 남는다.
그런데 이들은 있거나 없거나 <삶>에 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생사고통과 관계된 내용>이 우선 중요하다.
<생사고통과 관계없는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은 당장 알거나 모르거나 큰 관계가 없다.
알아도 크게 삶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래서 쓸데없고 실익이 없는 <희론>으로 그친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생사고통의 제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수행자는 <이런 부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생사고통>과 <그 발생원인>부터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수행의 목표 상태>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즉 <고통을 제거해 고통이 없어진 상태>가 목표상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행방안>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 <4제법>의 내용이 된다.
<업>을 행해 그 결과로 <생사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업은 <망상분별>과 <집착>에 바탕해 행하게 된다.
그래서 <업>을 중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 번뇌>를 잘 제거해야 한다.
현실에서 한 주체가 <자신>을 가장 <집착>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모든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망집번뇌>부터 잘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 현실에서 <자신>의 <본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
그래서 <신견>을 잘 제거한다. [신견의 제거]
한편, <자신>이 <영원하다>고 여긴다.
그러면 이를 <실답다>고 여긴다.
그리고 <집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상견>을 잘 제거해야 한다.
한편,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또 <잘못된 목표>를 <잘못된 방안>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윤회> 과정에서 <생사고통>을 극심하게 받게 된다.
따라서 <단멸관>을 잘 제거해야 한다. [변견(단견, 상견)의 제거]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한 주체가 <고려해야 할 기간>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과정에서 <업>과 관련한 <인과>를 이해해야 한다.
한번 행한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량겁에 걸쳐 <그 과보>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런 <업>에 따른 <인과 문제>부터 잘 살펴야 한다. [사견의 제거]
또한 <수행목표>를 성취할 <수행방안>을 잘 이해해야 한다. [계금취견의 제거]
그 외 <잘못된 견해>가 수없이 많다.
이 가운데 <삶>에서 엉뚱한 <업>을 행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경우부터 하나하나 잘 제거한다. [견취견의 제거]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전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한다.
<연기법>도 잘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의 <정체>와 <그 관계> 전반을 <실상>을 꿰뚫어 잘 이해한다.
이를 통해 앞에 나열한 <5 견>을 잘 제거한다.
그리고 <근본 무명 어리석음>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 <3혜>를 잘 닦아나가야 한다.
즉, 평소 <올바른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읽는다. [문혜]
또 그 내용을 놓고 올바로 <생각>한다. [사혜]
그리고 그 내용을 현실에서 올바로 <실천>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 내용을 검토해나간다. [수혜]
♥Table of Contents
▣- 정사유
정사유는 <올바른 뜻과 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업을 깨끗이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리석음, 탐욕, 분노>에 바탕해 <의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에 바탕해, 선한 서원(誓願),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하지 않는다.
즉, 그릇된 견해에 바탕해 의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법문>을 배우고 닦아 실천한다.
그리고 깊이 <실상>을 꿰뚫어 <현실의 정체>에 대해 지혜롭게 헤아린다.(사실판단)
그리고 <가치와 선>과 관련해 지혜롭게 깊이 헤아린다. (가치판단)
또한 <인과>에 대해 지혜롭게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쓸데없는 <희론>을 일삼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지혜에 바탕해, <자비희사 > 4 무량심의 마음을 일으킨다.
[因緣觀인연관, 智慧지혜]
- <탐욕>을 제거한다.
탐욕이 가져오는 <과보의 더러움>을 관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탐욕을 버린다.
그리고 탐욕에 기초한 뜻을 갖지 않는다.
또한 좋음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이에게 베푼다. [보시]
그리고 번뇌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선한 서원>(誓願)을 일으켜 갖는다.
[不貪欲불탐욕, 不淨觀부정관, 無貪무탐, 誓願서원]
-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억울한 고통>과 <욕됨>에 처해, 평안히 참는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제거한다.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자신을 해치는 상대에 대해 <보복>하고 <해치려는 뜻>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거슬리는 상황이나 상대에 대해 <자비심>을 일으킨다.
더 나아가 온 생명을 차별없고 제한없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한다.
다만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편>들을 취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상(相)을 취하지 않고 현실에 임한다.[ 무상삼매]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님을 관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무한한 생사윤희> 과정을 고려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과거생에 자신과 <부모 자식 관계>였음을 생각한다.
또 모든 생명이 장래 <최상의 존재>로 바뀌게 됨을 생각한다.
그리고 함께 돕고 <협력>해야 공덕을 얻게 됨을 생각한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다.
또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상대에 <연민의 정>을 갖고 대한다
또는 선생님이 어린 학생을 대하듯, 상대에 <공감>하려 노력한다.
[不瞋恚불진에, 忍辱인욕, 無瞋무진, 慈悲자비]
정사유는 정지(正志) 정분별(正分別)라고도 한다.
[正思惟정사유, samyak-saṃkalpa]
8정도에서 정견, 정사유 내용은 서로 혼동될 수 있다.
글자로만 대하면, 정견(正見)은 눈을 통해 똑바로 정확히 보는 활동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정견>은 4제법을 통해 <올바로 관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상의 정체나 인과, 그리고 수행목표, 그 실현 방안에 관해 올바로 관한다.
한편 글자로만 대하면, 정사유(正思惟)는 올바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활동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정사유>(正思惟)는 정견(正見)의 바탕에서 <올바른 뜻을 일으켜 갖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of Contents
▣- 정어
<정어>는 바르게 말함을 의미한다. [정어正語, samyag-vāc]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망어不妄語]
말할 때는 <참된 말>을 한다. [진실어眞實語]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양설不兩舌]
말할 때는 <서로를 화합시키는 말>을 한다. [화합어和合語, 화쟁어和諍語]
욕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악구不惡口]
말할 때는 부드럽고 순박하고 <사랑스런 말>을 한다. [유순어柔順語, 유연어柔軟語]
<실없고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불기어不綺語]
말할 때는 <쓸모 있고 이치에 맞는 올바른 말>을 한다. [질직어質直語]
생활에서 <잘못된 말>이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또 다른 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잘못된 업>을 행하게 한다.
그로 인해 다른 이가 <생사고통>을 겪게 한다.
그런 경우 자신도 그로 인해 <고통>을 되돌려 받게 된다.
그렇다고 현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필요한 경우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상대의 말>부터 경청한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다.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망상 분별>에 바탕한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옳다고 여기는 내용>이 반드시 <엄격한 진리판단>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자신이나 영희라고 여기고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통상 <감각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관념분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신>이나 <영희>는 아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영희가 이곳에 왔다>라고 여기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렇다 해도 그 상황에 영희나 <영희의 오고감>이 그 현실에 그처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현실 상황에서 대부분 <영희가 그처럼 있다>고 여긴다.
또, <영희가 그처럼 왔다>고 여긴다.
그런 경우 현실생활에서 <경험에 위배되는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된다.
<계(戒)에서 금하는 거짓말>은 이런 내용과 관련된다.
계는 <일상생활>을 기초로 <생사 고통을 벗어나는 기초적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와 말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그 말은 <거짓이 아닌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시키거나 <싸우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자신과 상대에게 모두 <유익하고 바람직한 내용>이어야 한다.
한편 <엄격한 진리판단>상 올바른 깨달음에 기초한 <옳은 내용>은 따로 경전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위와 같은 <계가 성취된 바탕>에서 닦아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진리판단상 옳은 내용>은 그런 바탕에서 설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가치판단상 올바른 내용>도 그런 바탕에서 설해나가야 한다.
또 설할 경우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표현해야 한다.
또 상대가 <관심>을 갖도록 상대의 관심에 맞추어 말한다.
그리고 되도록 내용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내용을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말한다.
관련된 내용을 모두 나열하며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상대가 그 내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상대가 오래 <기억>하고 지닐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대가 <올바르고 옳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말을 하는 의미와 <효용과 가치>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정업
정업은 <올바른 업>을 행함을 뜻한다. [정업正業, samyak-karmānta]
업에는 넓게 <신>ㆍ<구>ㆍ<의> 3업이 있다.
이 가운데 <의업>은 뜻을 짓는 업이다. 이는 <정사유> 항목에 포함된다.
<구업>은 말로 하는 업이다. 이는 <정어> 항목에 포함된다.
<신업>은 몸으로 하는 업이다. 이는 <정업>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업>에서는 3업 가운데 신업만 살핀다.
수행자는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각 생명은 각기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등에 집착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좋음을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함부로 <침해>하기 쉽다.
그런 경우 서로 간에 <가해>와 <피해>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후 <보복>을 서로 행한다.
그래서 <가해>와 <피해>를 반복해 주고 받는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업의 장애>가 쌓인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간다.
따라서 <상대가 집착하는 바>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불살생不殺生]
다른 이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다. [불투도不偸盜]
<간음>하지 않는다. [불사음不邪婬]
각 생명을 <가장 좋은 상태>로 이끈다.
다른 생명이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끝내 벗어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 다른 생명이 <깨달음>을 얻고 <망집>을 제거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부터 먼저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온다.
그리고 자신부터 <깨달음>을 얻고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되도록 좋은 <선교방편>을 통해 중생을 제도한다. [선교방편]
이를 위해 다른 생명이 <복덕>과 <수명>, <지혜>를 갖추도록 이끈다.
또 이를 위해 자신부터 <복덕>과 <수명>, <지혜>를 구족한다.
죽음에 처한 <생명>을 살린다. [방생放生]
<좋음>을 아낌없이 필요한 이에게 베푼다. [보시布施]
<고통과 공포>를 덜어준다. [무외시]
<올바른 길>과 <지혜>를 베풀어준다. [법보시]
중생들이 집착하는 <좋은 물건>을 베푼다. [재보시]
<바르고 깨끗한 행위>를 한다. [청정범행淸淨梵行, 정행淨行]
♥Table of Contents
▣- 정명
<정명>은 <올바른 생활>을 뜻한다. [정명正命, samyag-ājīva]
살아가려면 의식주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양한 <삶의 방편>을 찾아 행한다.
그런데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릇된 생활 방도>[사명邪命]를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범죄가 되는 방식>으로 생활하지 않는다.
<다른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일>로 생활하지 않는다.
그릇된 생활은 <업의 장애>를 쌓게 한다.
그리고 <생사>에 묶이게 만든다.
따라서 <청정한 방편>을 통해 생활한다.
출가 수행자는 이 요구가 더욱 엄격하다.
수행자가 <옷 세 벌>, <구걸해 식사를 해결할 그릇>, <무덤가 숲속거처>만 가지고 있다고 하자.
수행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행>에 전념한다.
수행시에도 최소한 <옷>, <음식>, <거처>, <약> 등이 필요하다. [4의지]
이런 경우 <필요한 물품>을 법답게 구한다.
그리고 출가수행자는 <기망>이나 <사술>, <점>이나 <주술> 등으로 생활하지 않는다. [五邪命]
♥Table of Contents
▣- 정정진
이는 <올바른 노력>을 뜻한다. [正精進정정진, 正直方便정직방편, samyag vyāyāma]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악업>을 중단하고 <선업>을 닦아 나간다.
또 이를 위해 근본원인인 <망집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정정진>의 수행은 <4정근>과 관련된다.
즉, <이미 일어난 악>은 키우지 않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행하지 않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부지런히 행한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키운다.
그래서 <그간 행한 업>이 만들어 놓은 <장애>를 제거한다. [業障업장, karmāvaraṇa]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런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다. [菩提보리]
그래서 이런 수행노력을 <해태>와 <방일함>을 떠나 꾸준히 노력해간다.
♥Table of Contents
▣- 정념
수행을 통해 <올바른 선>과 <옳은 진리>의 내용을 익힌다.
<정념>은 이처럼 익힌 내용을 잊지 않고 <마음에 잘 머물게 함>을 의미한다. [정념正念 samyak-smṛti]
정념은 <실념>(失念, muṣitasmṛtitā) 또는 <망념>(忘念)과 반대된다.
<실념> <망념>은 내용을 <잊어버림>을 의미한다.
수행을 통해 경험하고 닦아 익힌 내용이 있다.
그런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잘 <기억>한다.
그리고 마음에 지닌다.
그리고 필요할 때 마음에 바로 <떠올린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그래야 필요한 내용을 올바르게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정념>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잘못을 같은 형태로 무한히 <반복>한다.
또한 수행을 해도 수행결과가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진전>이 없게 된다.
정념은 <4념처 수행>과도 관련된다.
4념처는 <신ㆍ수ㆍ심ㆍ법>(身受心法)의 <부정ㆍ고ㆍ무상ㆍ무아> 등을 관한다.
♥Table of Contents
▣- 정정
<정정>은 하나의 내용에 마음을 <집중함>을 뜻한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고 안정된 상태>에 이름을 의미한다. [정정正定 samyak-samādhi]
이를 통해 <산란한 상태>를 떠난다.
그리고 <들뜨거나 가라앉은 상태>를 떠난다.
이를 통해 <번뇌>와 <악업>을 제거한다.
또한 이에 의존해 <올바른 보리의 깨달음>을 얻어나간다.
8정도는 이와 같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8정도는 크게 <계ㆍ정ㆍ혜>로 나눌 수 있다. [3학]
이들 <계ㆍ정ㆍ혜>는 다 함께 깨달음을 증득하는데 필요하다.
현실에서 수행을 잘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먼저 <생사현실> 안에서 <계>가 성취되어야 한다.
<계>가 성취되면 <생사현실> 안에서 <복덕자량>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복덕자량>이 갖춰져야 <삼매>를 잘 닦을 수 있다.
그리고 <삼매>를 닦아야 <지혜>를 잘 성취할 수 있다.
▲▲▲-------------------------------------------
● 이상의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100~114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3장_부처님의_가르침_(0).txt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
● 다음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합해서 살피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115~124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3장-02계율.txt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Table of Contents
▣- <계ㆍ정ㆍ혜> 3학을 통한 번뇌의 근본제거
일반인은 생사현실에서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근본 무명]
그리고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의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받아나간다. [망집번뇌(혹)-업-고]
따라서 이런 <생사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고통을 예방하는 방안이 된다.
그래서 평소 (망집> 에 기초해 갖던 희망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행하던 <업>을 중단해야 한다 . [무원무작 삼매해탈]
그리고 그 대신 <계ㆍ정ㆍ혜> 3학을 닦는다.
이런 수행방안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안과 정반대다.
즉 당장 세속에서 행하던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수행을 행한다.
이 과정에는 어느정도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장구한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생사고통에 비교한다고 하자.
그러면 수행에 드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작다.
그래서 이는 생사고통을 <예방>하는 방안이 된다.
수행자는 이런 수행과정에서 수행을 통해 성취할 <목표 상태>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과정의 어려움을 참아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행을 원만히 성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계율에는 일반 신도의 <5계>(戒), <8재계>(齋戒)가 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인 경우 먼저 사미 사미니 <10계>(戒)가 있다.
그리고 <구족계>(具足戒)로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나열된다.
한편 대승보살 수행자인 경우는 3귀계(歸戒)ㆍ3취정계(聚淨戒)ㆍ10중금계(重禁戒)ㆍ48경계(輕戒) 등이 제시된다.
한편 수행을 위해서는 삼매[정] 수행이 필요하다.
마음을 하나의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들뜬 마음> 상태를 벗어난다.
또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음> 상태도 벗어난다.
<삼매 >수행에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심일경성>이라 표현한다.
<심일경성>의 상태에서는 <욕계 >상태에서도 이룰 수도 있다. [욕계정]
그러나 욕계상태는 망상분별로 <상(相)>을 취하고 임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떠난다.
그래서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불교수행에서는 <색계 4선> <무색계 4선>을 닦아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지혜>를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근본무명과 <번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간다.
이들 <계ㆍ정ㆍ혜> 3학을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기본적인 계의 덕목의 성취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을 시작한다.
이런 경우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계율>을 잘 닦아야 한다.
즉 모든 수행은 <계>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세속현실에서는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 <업>으로 인해 3악도의 <생사고통>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의 성취가 필요하다.
재가 신자가 처음 닦는 계로는
넓게 <3귀의계> <10선법계>, <5계(戒)>, <8재계(齋戒)>를 들 수 있다.
다만 좁게는 5계, 8재계만을 든다.
일반적으로 생사현실안에서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먼저 10선법을 닦는다.
그리고 계를 성취해야 한다.
이는 일반인이 망집을 바탕으로 한 세속 생활을 기초로 한다.
즉 이는 세속현실에서 <근본 무명과 망집 번뇌>를 일단 그대로 둔다.
그런 가운데 닦아나가는 수행이다.
그런 바탕에서 장차 3악도의 <생사고통>을 예방함에 목적을 둔다.
그리고 장차 수행에 점차 <가까워질 수 있게 함>에 목적을 둔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근본 무명>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 무명을 제거하는데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수행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사현실안에서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선 생사현실 안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10선법을 닦는다.
그리고 <계>를 닦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안에서 생사고통을 심하게 받는 상태에 처한다.
그리고 이후 그런 상태로 장구하게 묶이게 된다.
그런 경우 이후 지혜를 닦는 일도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10선법과 계를 닦는다.
그리고 기존에 쌓아 놓은 업장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극심한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일단 벗어나야 한다.
그런 경우 이후 수행을 다시 행해 나간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묶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경우 수행자는 근본적으로 일체의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즉 <근본 무명 어리석음 등 >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려 수행을 닦는다.
그리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해탈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출가 수행을 행하게 된다.
출가 수행자인 경우에도 역시 먼저 계의 원만한 성취를 이뤄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안에서 먼저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혜를 닦는 수행은 이처럼 계를 성취한 기초에서 닦아 나가게 된다.
한편 근본 무명을 제거해 생사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생사 현실에 남아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처럼 생사 현실에 임하는 이상, <계>를 닦는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성문승의 출가 수행자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자신이 생사윤회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래서 무여열반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출가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 수행해 간다.
그런데 이런 출가 수행자들은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선 다른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수행자 집단은 다 함께 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정하게 수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출가 수행자 단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규칙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출가수행자의 경우 먼저 사미 사미니 10계(戒)를 닦는다.
그리고 비구 비구니의 <구족계>(具足戒)로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나열된다.
이외에도 8정도 가운데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항목이 있다.
이들도 역시 계의 항목에 해당한다.
한편 보살 수행자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즉 중생 제도와 성불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대승 보살은 생사현실을 벗어남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을 제도해 나가게 된다.
그런 경우 세속현실에서 <계>를 닦는 수행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대승보살의 경우는 이런 취지에 맞게 계의 내용이 약간 달리 제시되게 된다.
대승 보살이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수행자는 그 자신부터 일단 생사고통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고 자신부터 계를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보시 등 계의 덕목을 닦는다.
이를 통해 수행자 자신의 업장부터 제거된다.
그리고 다 제거된 이후은 복덕 자량을 쌓아 나가게 된다.
이처럼 복덕자량이 쌓이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기초에서 이후 지혜자량을 원만하게 쌓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원만히 구족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수단으로 중생제도를 잘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승 보살 수행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계가 제시된다.
즉 3귀계(歸戒)ㆍ3취정계(聚淨戒)ㆍ10중금계(重禁戒)ㆍ48경계(輕戒) 등이 그것이다.
한편 보살 수행자는 6바라밀다를 닦는다.
이 가운데 <보시, 정계, 안인> 항목이 있다.
이는 모두 넓게 <계>의 수행 덕목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업장>이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
그리고 쌓인 업장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후 <복덕 자량>을 쌓게 한다. 【1】
한편 정진과 정려는 복덕자량과 지혜자량 모두에 관련된다.
즉 <정진>바라밀은 <계율>과 <4무량심>을 닦는 경우 <복덕자량>을 쌓게 한다.
한편 <정려>바라밀도 <4무량심>을 닦는 경우 <복덕자량>을 쌓게 한다.
한편 <정진>과 <정려>는 또 한편 <지혜자량>을 쌓게 한다. 【2】
【주석】---
【1】 { K0154V10P0733c10L; 初三但是增上戒學所攝靜慮一種 『해심밀경』(解深密經), 제4권, 7. 지바라밀다품(地波羅蜜多品), 당 현장역(唐 玄奘譯), K0154, T0676 }
【2】 { K0570V15P0766b03L; 云何爲福云何爲智謂略說福卽是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36권 본지분중(本地分中) 보살지(菩薩地) 제 15 초지유가처(初持瑜伽處)의 자타리품(自他利品) 제 3의 나머지[餘], 미륵보살설. 당 현장역(彌勒菩薩說. 唐 玄奘譯), K0570, T1579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본성적인 계와 차계
5계 가운데 처음 4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살생(殺生)ㆍ투도(偸盜)ㆍ사음(邪婬)ㆍ망어(妄語)를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삶에 임하는 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집착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재산과 자신의 가족을 집착한다.
그런데 다른 생명도 자신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른 생명도 제각각 집착하는 바가 같다.
그래서 결국 생명과 신체, 재산, 가족, 진실 등을 집착한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 가족 등이 침해 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짓된 내용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자신부터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다른 생명과 신체, 재산, 가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거짓을 다른 이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생명이 이처럼 집착하는 것>을 침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생사현실에서 <본질>적인 <죄악>의 성격을 갖는다. [성계性戒]
이는 모든 생명이 삶에 임하는 한 집착하게 마련인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업은 각 주체 간에 <가해 피해 관계>를 만든다.
따라서 <업의 장애>을 쌓이게 한다.
그리고 <고통의 과보>를 받게 만든다.
따라서 수행시 기본적으로 금한다.
이런 침해가 이뤄지는 배경사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주체가 기본적으로 무명 어리석음에 기초해 임한다.
그리고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탐욕을 일으킨다.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해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분노를 일으켜서 행하기도 한다.
또는 집착하는 것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하기도 한다.
또는 침해를 받고 분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보복을 하기 위해 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가해를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상대도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즉 상대도 장차 그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해를 행하게 된다.
또 이미 받은 침해에 보복하기 위해 행하게 된다.
그런 경우 또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같은 사정으로 서로 가해를 반복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서로 간에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것을 침해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악의 성격을 갖는다. [성계性戒]
그래서 자신이 이런 업을 처음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서로 간에 가해와 피해 관계가 반복해 이뤄지게 된다.
그래서 상호 악순환 관계를 만든다.
이는 서로 상대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
그래서 서로 악업을 행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업의 장애 현상을 만든다. [업장]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수행시 기본적으로 이를 금한다.
그러나 <음주>(飮酒)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그 본질이 <악>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부처님이 수행을 위해 금한 항목이다. [차계遮戒]
♥Table of Contents
▣- <10선법>과 <계>와 <율>의 관계
<5계>의 앞 4항목은 <10선법>과도 유사하다. 【1】
따라서 <계>와 <10선법>의 성격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0선법>은 망집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으로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여건상 좀더 힘들다.
그래서 일단 이는 뒤로 미룬다.
그런 가운데 <당면한 생사고통>을 벗어남에 취지가 있다.
그래서 3악도를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인간에서 <하늘>에 태어남을 주된 목표로 한다.
한편 <계>는 <생사 묶임>에서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즉, <해탈 열반>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계율>과 <10선법>은 취지를 달리한다.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망집>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계>는 이런 취지의 <수행>에 요구되는 규범이다.
그래서 수행의 원만한 성취를 위한 규범 성격을 갖는다. [계戒 śila]
이런 점에서 계율과 10선법은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10선법이 수행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생사고통을 받는 <3악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수행자는 당연히 <10선법>을 기초적으로 먼저 닦는다.
그래서 <성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3 악도를 벗어난다.
그리고 인간과 하늘을 오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상태가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생사 묶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이를 위한 수행을 해나간다.
그래서 <수행>에는 결국 이들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
(10선법 내용 → 8정도의 정사유ㆍ정어ㆍ정업, 4정근)
그래서 10선법 내용은 수행자가 닦아야 할 <규범>에 넓게 포함된다.
그래서 <계>는 크게 <섭선법계>ㆍ<섭율의계>ㆍ<섭중생계>(=요익중생계)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율>은 <규칙 성격>이 강하다.
즉 <단체 출가 수행>에서 각 수행자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십선법>과 <계>와 <율>의 성격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주석】---
【1】 십선법
십선이란 다음이다.
① 불살생(不殺生)
② 불투도(不偸盜):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③ 불사음(不邪淫)
④ 불망어(不妄語)
⑤ 불양설(不兩舌)
⑥ 불악구(不惡口)
⑦ 불기어(不綺語)
⑧ 불탐욕(不貪欲)
⑨ 부진에(不瞋恚)
⑩ 불사견(不邪見)
이러한 10선은 3업(三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①∼③은 신업(身業),
④∼⑦은 구업(口業),
⑧∼⑩은 의업(意業)이 된다.
반대로 이를 범하는 것을 10악(十惡)이라고 한다.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계>와 <율>의 구분
<계>와 <율>의 성격구분이 필요하다.
수행자는 <출가>해 집단을 이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경우 각 수행자는 <다른 수행자의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야한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수행자의 생활형태는 그 수행단체가 사회 내에서 존중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행 생활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위해 <단체 수행에 필요한 규칙>이 추가된다. [율律 vinaya]
이는 단체 수행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수행을 증진시키는 방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율>은 단체 수행에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다만 수행자가 출가해 수행하며 부딪히는 구체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 가운데 출가 수행자는 수행을 위해 올바로 정진 노력해야 할 내용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량하다.
그래서 미리 모든 상황을 일일히 나열해 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가운데 출가 수행자의 특정한 행위로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는 비교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좀더 많은 내용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부처님은 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계율을 제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범수제(隨犯隨制) 방식에 의해 계율을 제정한다.
즉,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하나하나 제정한다.
그래서 계율이 정해지기 전에 수행자가 처음 문제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자.
이런 경우는 계율을 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가장 처음에 아직 계를 제정하기 전에는 범한 것이 아니니라.”【1】
계율의 내용을 미리 예상해서 세세하게 정하지 않는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비유로 살핀다면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상황에서 수행에 도움되는 형태는 뚜렷하다.
이는 산수 문제 3+4의 값이 7로 명확한 것과 같다.
그리고 3+4 =7 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은 단순하다.
그런데 반대로 구체적 상황에서 수행에 어긋난 행위은 오히려 무한에 가깝다.
이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산수 문제 3+4에 대한 틀린 값은 무한하다.
그리고 <답을 잘못 적어 내는 경우>와 <그 방식>은 무량하다.
이런 사정과 마찬가지다.
<수행>도 사정이 같다.
<올바른 수행목표>를 성취하는 <올바른 수행방안>이 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방안>은 무량하다.
이것을 모두 다 예견해 <미리 규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실 사정상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자.
그리고 <문제될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에 한해 하나씩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단>은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수단>은 그 <목적>으로부터 <가치>를 부여 받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A라는 수단으로 B가 성취되어 나타난다.
이 경우 B가 나타나는 <발생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단 A>이 성취된다.
그래서 그 <목적 B>이 달성되어 나타난다.
즉 A → B 의 관계다.
그러나 <가치>의 발생은 이와 반대다.
먼저 <목적 B가 갖는 가치>가 있다.
이를 통해 <그 수단 A>가 <가치>를 갖게 된다.
B → A 의 관계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목표>에 따라 <계율 내용>도 조금씩 변동이 있게 된다.
그런데 수행 목표와의 관계성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자.
그리고 미리 독립적으로 계율내용을 모두 나열해 규정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주석】---
【1】 { K0896V23P0598c07L; 佛言初未制戒不犯 『사분율』(四分律), 제57권 第四分之八 36. 추가로 보충함[調部] ③
요진 불타야사공축불념등역(姚秦 佛陀耶舍共竺佛念等譯), K0896, T1428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에서의 계율
<수행목표>가 <자신만의 생사 해탈>인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먼저 생사현실에서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업장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불살생 등의 계의 수행덕목이 가장 기초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런 계를 닦아야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이후 지혜를 잘 닦아나갈 수 있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계>의 수행덕목을 닦아 <업의 장애>를 우선 제거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지혜자량>을 닦는다.
그리고 <망상분별>과 <번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에서 벗어난다.
한편, <수행목표>가 <중생의 제도>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한다.
그래서 <제도하려는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임한다.
한편 다른 이를 제도하려면 그 자신부터 <생사 고통의 묶임>에서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을 구족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스스로 <복덕>과 <지혜자량>을 구족한다.
그래서 이 경우 역시 생사현실에서 <계>를 잘 성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에서 <복덕자량>을 쌓는다.
이를 통해 <지혜자량>을 닦을 바탕을 마련한다.
그리고 <지혜자량>을 닦는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방편>을 구족한다.
다만. 이 경우 <제도하려는 중생의 상태>가 제각각 다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구체적 계율 내용>이 변동이 있게 된다.
이는 <어떤 방편>이 <목표>의 성취에 가장 적절한가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개인 생사해탈>이 목표일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목표에 맞춰 <계율>이 제시된다.
<술>도 엄격히 금한다.
또 수행에 방해되는 <오락행위>나, <이성과의 접촉>도 금한다.
이런 식이다.
한편 수행자들이 출가해 <단체>를 이뤄 수행한다.
그런 경우 각 수행자는 <다른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의 <수행에 장애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행 단체가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행위도 곤란하다.
그래서 전체 수행자가 <함께 수행을 잘 성취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규칙>이 제정된다.
한편, <다른 중생의 제도>가 수행목표인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는 일단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데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면 수행자 자신부터 3악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중생>과 접촉을 자주 해야 한다.
또한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할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상대 중생으로 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도록 원만히 이끌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위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중생제도가 더 힘들 수 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보살 수행자의 계의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달리 제시되게 된다.
즉, <보살계>의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달리 제시되게 된다.
이는 <병원> 상황과 같다.
병원에는 당장 병을 나아 퇴원하는 것이 목표인 <환자>도 있다.
그런데 병을 나은 후에는 <장차>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려는 입장도 있다.
또 <현재>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도 있다.
이런 각 경우 <규칙>이 조금씩 달라진다.
<환자 입장>이라고 하자.
이 경우 일단 그 환자 자신이 병을 나아 <퇴원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다.
그래서 이를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가 <자신의 병>을 치유하려 한다.
그런데 동시에 <장차> <의사>가 되어 다른 환자치료도 하려 한다.
이 경우 자신부터 병을 잘 치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 필요한 기본 내용을 당연히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환자가 병을 낫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내용이 있다.
이는 의사도 당연히 함께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의사부터 <병>에 걸리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 의사가 되고 <환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익혀야 한다.
한편 <현재>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 입장과는 다르다.
즉, 오로지 자신의 병을 치료해 퇴원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의사의 규범은 <환자 치료>를 위해 내용이 달라진다.
결국 <각 계율>은 <수행의 최종목표>와 관련되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어떤 방안>이 <수행목표>를 잘 성취하게 하는가에 의존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계를 원만히 잘 성취해야 한다.
수행자가 개인적으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을 얻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계의 성취는 필요하다.
그런데 보살 수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생사현실에서 계를 원만히 구족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복덕자량을 구족할 수 있다.
그래야 이후 정려나 지혜의 덕목을 원만히 닦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해갈 수 있다.
그리고 수행목표를 원만히 잘 성취할 수 있다.
생사현실 안에서 가장 원만히 계를 잘 성취하고 실천하는 이라고 하자.
그가 곧 부처님이기도 한 것이다.
계는 수행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 성취된다.
그런 사정으로 수단의 가치는 목적에 의존한다.
즉, 목적이 갖는 가치를 기초로 그 실현 수단이 가치를 갖게 된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수단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이는 비유하면 <전등>을 켜고자 하는 상황과 같다.
그래서 이를 위해 <스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잘 찾아야 한다.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방바닥>과 <천정> 쪽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극단>을 떠난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스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있는 곳을 그 때 그 때 잘 찾아내야 한다.
수행도 사정이 같다.
그래서 결국 <반야지혜>로 매 경우 <실상>을 꿰뚫어 <각 경우>를 잘 분별해야 한다.
<계율>도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수행목표>를 잘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목표를 잘 성취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그 때 그 때 잘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매 경우 주어진 <계율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임하기 쉽다.
여하튼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잘 성취해야 한다.
수행자가 개인적으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런 경우 먼저 <업장>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서 일단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후 <복덕>을 구족해야 한다.
그런 바탕이 되어야 <지혜>를 잘 닦아나갈 수 있다.
그런데 <계>를 닦아야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복덕자량>을 구족할 수 있다.
그래서 <계>의 성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행자가 다시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려면 수행자 자신부터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할 수단>과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런데 <계>를 닦아야 <복덕자량>을 구족할 수 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후 <정려>나 <지혜>의 덕목을 원만히 닦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제도>해갈 수 있다.
그리고 <수행목표>를 원만히 잘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계>는 어느 경우나 가장 <기본적 필수 수행덕목>이 된다.
여기서는 <재가신자>의 5계, 8 재계, <사미> 10계, <보살> 10중계의 항목만 간단히 살피기로 하자.
♥Table of Contents
▣- 5계
<재가신자>는 먼저 <불ㆍ법ㆍ승> 3 보에 <귀의>한다. [3귀의]
저 아무개는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으로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존귀하신 분께 귀의하겠습니다.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법(法)으로서 욕탐을 여읜 존귀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승(僧)으로서 중생들 가운데 존귀하신 분들께 귀의하겠습니다.
대덕께서는 염두에 두고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우바새이며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과 업을 청정하게 하겠다는 다짐에 귀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고 나면 5계(戒)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일을 지어야 한다. 【1】
그리고 <5계>를 준수한다.
이것이 일반인이 재가 불교신자가 되는 기본요건이다.
5계는 다음이다.
1. <생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불살생계不殺生戒].
2.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不盜戒부도계 / 不與取불여취계]
3. 남녀 간에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간음을 하지 않는다. [不婬戒불음계]
4.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不妄語戒불망어계]
5. <술>을 마시지 않는다. [不飮酒戒불음주계] 【2】【3】【4】【5】【6】
*요약- 살도음망주(殺盜婬妄酒)
이는 <재가의 불교 신자>가 준수하는 5종의 항목이다. [五戒오계, pañca-śīla]
재가의 <남자 신자>는 <우바새>(優婆塞 upāsaka)라고 칭한다.
재가의 <여자 신자>는 <우바이>(優婆夷 upāsikā)라고 칭한다.
【주석】---
【1】 { K0938V24P0487c20L; 大德憶念我某甲盡形壽歸依佛兩兩足尊.. 『불아비담경출가상품』(佛阿毗曇經出家相品), 하권, 진 진제역(陳 眞諦譯), K0938, T1482 }
【2】{ K0650V18P1036c13L; 世尊云何名 優婆塞戒具足 佛告摩訶男 優婆塞 離殺生 不與取 邪婬 妄語 飮酒 不樂作 摩訶男 是名優婆塞戒具足 『잡아함경』(雜阿含經), 제33권 927. 우바새경(優婆塞經) 류송 구나발타라역(劉宋 求那跋陀羅譯), K0650, T0099 }
【3】{ K0412V13P0520b02L; 不殺衆生不盜他財物不非梵行...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菩薩戒品第二, 양 승가바라역(梁 僧伽婆羅譯), K0412, T0468 }
【4】{ K0938V24P0488a04L; 捨離殺生盡形壽捨離盜盡形壽捨... 『불아비담경출가상품』(佛阿毗曇經出家相品), 第二 <卷下>, 진 진제역(陳 眞諦譯), K0938, T1482 }
【5】{ K0955V27P0556a18L; 第一近事律儀何等名爲五所應離 一者殺生 二不與取 三欲邪行 四虛誑語 五飮諸酒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14권 4. 분별업품 ②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6】 5계는 8관재계 및 사미10계 등에서도 공통한다.
그런데 경전 율장 논서 및 개별 불교 사전 등에서 모두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
그러나 기본 내용자체는 같다.
여기서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용어를 다음처럼 일반적 표현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통일표현 - 불아비담경 구사론俱舍論 문수사리문경 - 잡아함경
不殺生戒불살생계 - 捨離殺生사리살생 - 殺生살생 - 不殺衆生불살중생 -離殺生이살생 不殺戒불살계
不盜戒부도계 - 捨離盜사리도 - 不與取불여취 - 不盜他財物부도타재물 -不與取불여취 不偸盜戒불투도계
不婬戒불음계 - 捨離邪婬사리사음 - 欲邪行욕사행 - 不非梵行불비범행 -邪婬사음 不邪婬戒불사음계
不妄語戒불망어계 - 捨離妄語사리망어 - 虛誑語허광어 - 不起妄語불기망어 -妄語망어
不飮酒戒불음주계 - 捨離飮酒사리음주 - 飮諸酒음제주 - 不飮酒불음주 -飮酒음주
참고
4.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012권]
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時,此城中,有一長者,名黑鹿子,於佛、法僧,深生敬信,歸依三寶,受五學處,
不殺生、不偸盜、不欲邪行、不妄語、不飮諸酒。
於此城中,多有知識婆羅門、居士,得意之處,若彼家中,有女長成,堪行婚娶者,便問黑鹿子言:‘汝知某家有童男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8관재계
<8관재계>는 재가자가 받아 지키는 계율이다.
이는 <6재일>에 재가자가 각기 <하루 동안> 받아 지킨다.
이날 재가자는 8가지 계율을 지킨다.
그래서 8관재계라고 명칭이 붙여진다.
[팔관재계八關齋戒 aṣṭāṅga-samanvāgatopavāsa ]
8가지 계율을 지키는 날은 다음의 6일이다.
이를 6재일이라 한다.
6재일은 음력으로 <8일>ㆍ<14일ㆍ15일>ㆍ<23일>ㆍ<29일ㆍ30일>이다.
이날 재가자는 <하루 동안> <승가>에 가까이 가 머무른다.
그래서 <출가승단>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승가의 생활>을 본받아 익히는 수행이다.
여기서 재계(齋戒)는 다음을 뜻한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면서 부정한 일을 금한다.
이러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출가 선근 공덕을 익힌다.
즉 재가 신자는 하루 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출가수행자의 마음으로 임한다.
그래서 하루라도 스님들처럼 정진한다.
그리고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려 한다.
그리고 출가승단의 생활을 본받아 익히게 하려는 취지다.
8관재계는 5계 항목에 다음 3 항목이 추가된다.
[팔관재계八關齋戒 aṣṭāṅga-samanvāgatopavāsa ]
6. 꽃다발이나 구슬, 향과 분, <장식물> 등으로 꾸미지 않는다.
<노래와 춤 광대놀이>를 보거나 듣지 않는다.
[塗飾香鬘도식향만 / 舞歌觀聽무가관청]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않는다. [不坐高廣大牀 부좌고광대상]
즉, 사치스럽고 화려한 자리에 앉지 않고 눕지 않는다.
8. <때 아닌 식사>를 하지 않는다. [不非時食불비시식] 【1】【2】【3】【4】
즉 정오가 지나 먹지 않는다.
* 요약- 살도음망주 도좌식(殺盜婬妄酒 塗坐食) 塗 칠할 도 飾 꾸밀 식, 鬘 머리 장식 만
이는 사미 사미니가 지키는 계에서 불축금은보계(不蓄金銀寶戒)가 제외된 형태다.
이는 재가신자가 생계 유지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외된 것이다.
***
【주석】---
【1】 { K0648V18P0256c04L; 云何名爲聖八支齋... 『중아함경』(中阿含經), 제55권 17. 포리다품(晡利多品) 제3 ①, 202) 지재경(持齋經)1) 제1제5 후송, 동진 구담승가제바역(東晋 瞿曇僧伽提婆譯), K0648, T0026 }
【2】 { K0823V20P1137a05L; 當說聖八關齋諦聽諦聽善思念之 『불설팔관재경』(佛說八關齋經), 류송 저거경성역(劉宋 沮渠京聲譯), K0823, T0089 }
여기에는 不習歌儛戲樂亦不著紋飾香熏塗身.. 등으로 제시된다.
【3】 { K0955V27P0556a21L; 何等名爲八所應離 一者殺生 二不與取 三非梵行 四虛誑語 五飮諸酒 六塗飾香鬘舞歌觀聽 七眠坐高廣嚴麗牀座 八食非時食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14권 4. 분별업품 ②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
【4】 { K0528V14P0333a17L; 八戒齋者 是過去現在諸佛如來 爲在家人制出家法 一者不殺 二者不盜 三者不婬 四者不妄語 五者不飮酒 六者不坐高廣大牀 七者不作倡伎樂故往觀聽不著香熏衣 八者不過中食 應如是受持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실역(失譯), K0528, T1486 }
【5】 이들 내용은 사미 10계 등과 부분적으로 공통된다. 다만 경전, 율장, 논서 및 각 불교사전에서도 약간씩 구체적 표현이 다르다.
되도록 사미10 계 내용과 함께 사용가능하고 되도록 짧은 한문표현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래서 통일해 표시하기로 한다.
6계 대표 표현 塗飾香鬘 舞歌觀聽 도식향만 무가관청 (구사론)
불설팔관재경 不習歌儛戲樂亦不著紋飾香熏塗身불습가무희락역불착문식향훈도신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不作倡伎樂故往觀聽不著香熏衣 부작창기악고왕관청불착향훈의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不著香華瓔珞以香塗身불착향화영락이향도신
문수사리문경 不歌儛倡伎、不著花香持天冠等불가무창기불착화향지천관등
대비바사론 離歌儛倡伎離塗飾香鬘이가무창기도식향만、
구사론 七 +순정이론 塗飾香鬘 舞歌觀聽도식향만 무가관청、
선견율비바사 권제16 不著香花瓔珞以香塗身; 불착향화영락이향도신 不歌儛作唱嚴飾樂器亦不故往觀聽乃至鬪諍悉不得看 불가무작창엄식악기역불고왕관청내지투쟁실부득관
6계 대표 표현 부좌고광대상 (수십선계경)
불설팔관재경 不於高廣牀坐亦不教人使坐불어고광상좌불교인사좌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不坐高廣大牀부좌고광대상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不坐臥高廣牀上부좌와고광상상
문수사리문경 不坐臥高廣大牀부좌와고광대상、
대비바사론 離高廣牀이고광상、
구사론 七 +순정이론 眠坐高廣嚴麗牀座면좌고광엄려상좌
선견율비바사 권제16 不高廣大牀上坐臥불고광대상상좌와
6계 대표 표현 불비시식
불설팔관재경 隨時食수시식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不過中食불과중식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不過中食불과중식
문수사리문경 不過中食불과중식
대비바사론 離非時食이비시식
구사론 七 +순정이론 食非時食식비시식
선견율비바사 권제16 不過中食불과중식
---
【3】 { K0955V27P0556b04L; 何等名爲十所應離?謂於前八塗飾香鬘舞歌觀聽開爲二種,復加受畜金銀等寶以爲第十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14권 4. 분별업품 ②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사미 사미니 10계
출가한 사미 사미니가 준수할 기본 계율이다. 【1】【2】
사미(沙彌, śrāmaṇera, [P]sāmaṇera)는 출가하여 10계를 받는다.
이후 250계를 받고 비구가 된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견습 스님을 가리킨다
통상 7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성 출가자를 가리킨다.
나이에 따라 7~13세는 구오(驅烏)사미라 한다.
음식을 보고 날아드는 까마귀나 쫓는 일을 맡는다는 의미다.
14~19세는 응법(應法)사미라 한다.
사미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세가 넘었으면서도 아직 비구가 되지 못하고 사미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자(名字)사미로 불린다.
사미는 근책남이라고도 한다.
또는 구적(求寂- 열반을 구함), 식악(息惡- 악을 쉼)이라고 한다.
여성인 경우는 사미니(沙彌尼)라고 한다.
사미 사미니가 지킬 계는 10항목이다.
이는 재가신자 5계 항목에 다음이 추가된다.
6. 꽃다발이나 구슬, 향과 분, <장식물> 등으로 꾸미지 않는다.
[부도식향만계不塗飾香鬘戒].
~ 꽃다발을 걸거나 향수를 몸에 바르지 않는다.
[ 불 착향화만 불향도신 不著香華鬘不香塗身 ].
7. <노래와 춤 광대놀이>를 보거나 듣지 않는다.
[불가무관청계不歌舞觀聽戒].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춤을 추지 않는다.
그리고 보려 가지 않는다.
그리고 듣지 않는다.
[ 불 가무창기 불왕관청 不歌儛倡妓不往觀聽 ].
8.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않는다.
즉, 사치스럽고 화려한 자리에 앉지 않고 눕지 않는다.
[부좌고광대상계不坐高廣大牀戒]
9. 때 아닌 식사를 하지 않는다.
[불비시식계不非時食戒].
10. 금이나 은 등의 보물을 받지 않고 비축하지 않는다.
[불축금은보계不蓄金銀寶戒].
~ 자연적으로 생겼거나 형상으로 만든 금이나 은 등 보물을 지니지 않는다.
[ 불착지생상금은보물 不捉持生像金銀寶物 ].
* 요약- 살도음망주 도가좌식축(殺盜婬妄酒 塗歌坐食蓄) 塗 칠할 도 飾 꾸밀 식, 鬘 머리 장식 만
이는 실질적으로 재가산자 8 재계 항목에 10번째 항목이 추가된 형태다.
【주석】---
【1】 { K0906V23P0749a14L; 盡形壽 不殺生 持沙彌戒 『사미십계법병위의』(沙彌十戒法並威儀), 실역(失譯), K0906, T1471 }
【2】 { K0913V23P0807a03L; 沙彌尼 初戒 不得殺生 『사미니계경』(沙彌尼戒經), 실역(失譯), K0913, T1474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대승보살의 10중계(十重戒)
보살 수행자에게는 십중계(十重戒)가 제시된다. 【1】【2】
1. 불살계(不殺戒).
2. 불도계(不盜戒).
3. 불음계(不婬戒).
4. 불망어계(不妄語戒).
5. <술>을 사거나 팔지 않는다. [불고주계不酤酒戒].
6. 재가, 출가의 보살 및 비구, 비구니의 <죄과>를 들추어 말하지 않는다. [불설과죄계不說過罪戒]
7.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불자찬훼타계不自讚毁他戒].
8.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는다. [불간계不慳戒].
9. <화>내지 않고 타인의 사죄를 받아들인다. [부진계不瞋戒].
10. 불ㆍ법ㆍ승 <3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불방삼보계不謗三寶戒].
*요약- 살도음망고 설자간진방(殺盜婬妄酤 說自慳瞋謗) 酤 술팔, 술살 고 慳 아낄 간
대승 보살 수행자는 중생을 이끌어 <생사묶임>에서 벗어나도록 <제도>하고 <성불함>에 초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설과죄계>(不說過罪戒)의 경우를 살펴보자.
누구나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수행자가 <죄과>를 범하는 일은 문제다.
그런 경우 이를 <참회>하고 고쳐야 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다른 이의 죄과>가 더 쉽게 의식된다.
그런데 이를 들추어 말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다른 이>가 이를 반성하고 방향을 돌리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그로 인해 <반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 대부분 <반발심>을 일으키기 쉽다.
그리고 상대에게 <미움>과 <원망> <분노> 등을 일으키기 쉽다.
그리고 상대가 다른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 지 샅샅이 찾아 나가려 한다.
자신도 상대를 <비난>하며 상응한 <보복>과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후 서로 <비난>하고 <가해>와 <피해>를 주고 받는 관계로 나가게 된다
그로 인해 수행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
그리고 서로 <협조>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사정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중생제도>와 <수행>에 효과가 더 낫다.
나머지 항목들도 사정이 같다.
대승 보살 수행자의 <수행목표 성취>에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 사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석】---
【1】 { K0527V14P0324a20L; 佛告諸佛子言有十重波羅提木叉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하권, 후진 구마라집역(後秦 鳩摩羅什譯), K0527, T1484 }
【2】 { K0530V14P0390c06L; 菩薩十重八萬威儀戒十重有犯無悔得使重受戒 八萬威儀戒盡名輕 有犯得使悔過對首悔滅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하권 7.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 요진 축불념역(姚秦 竺佛念譯), K0530, T1485 }
【주석끝】---
▲▲▲-------------------------------------------
● 이상의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합해서 살피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115~124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3장-02계율.txt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Table of Contents
▣- 정(定: 삼매)
다음과 같은 수행을 <정>(定)이라고 칭한다.
일정한 대상에 대해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자세하고 바르게 <관찰>한다.
이러한 <정>(定)은 <삼매>, <삼마제>, <삼마지>라고도 한다.
이런 <삼매> 수행은 수행항목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정관>, <자비관>, <수식관> 등은 수행 예비단계다.
이는 <5정심>의 수행항목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삼매 <수행>과 관련된다.
한편, 본 수행에서도 <삼매>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37도품가운데 다음 항목들이 삼매와 관련된다.
<4념처>ㆍ5근의 <정근>ㆍ5력의 <정력>ㆍ7각지의 <정각지>ㆍ8정도의 <정정>
이외 <9차제정>ㆍ<3삼매> 등과 같은 수행항목도 삼매와 관련된다.
그리고 <6바라밀다>의 정려바라밀다 등도 삼매 수행과 관련된다.
<삼매>의 기본은 마음을 하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함>에 있다. [心一境性심일경성, 審正觀察심정관찰]
수행자가 <집중>된 상태로 임한다.
그런 경우 먼저 다음 <번뇌>를 제거한다.
<탐욕>과 <분노>의 상태는 집중에 좋지 않다.
따라서 <탐욕>은 <부정관>에 의해 제거한다.
또 <분노>는 <자비관>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인자함>, <자애로움>, <어짊>, <착함> 등을 관한다.
이를 통해 분노를 제거한다.
또 마음이 <침울>하게 가라앉은 상태 또한 집중에 좋지 않다. [惛沈혼침, styāna]
또 <잠에 빠지는 것>도 집중에 좋지 않다. [睡眠수면, Middha]
이런 <혼침>과 <수면>은 <광명상>을 마음에 그려 제거한다.
또 공연히 <들떠 산란한 상태>도 집중에 좋지 않다. [掉擧도거, auddhatya]
또 <후회하는 마음> 상태도 집중에 좋지 않다. [惡作악작, kaukṛtya]
이런 상태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 제거한다.
즉, <망념>(妄念)을 쉰다.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머문다.
이런 노력으로 <도거> <악작> 상태를 제거한다.
한편 <스승>과 <가르침> 등에 대해 의혹을 일으키고 망설이기 쉽다.
이런 상태도 <집중>에 바람직하지 않다. [疑의, saṃdeha]
이는 <연기>(緣起)관에 의해 제거한다.
즉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노력으로 제거한다.【1】
한편 <집중>을 잘 이룬다.
그러면 반대로 이들 <번뇌>가 제거될 수 있다.
불쾌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 대상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건을 부수거나 상대를 해치는 행위로 나아간다.
그래서 <삼매>와는 반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분노> 상태에서는 삼매에 들기 곤란하다.
그러나 반대로 <삼매>에 든다.
그리고 <집중>하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경우 그런 상태에서는 <분노>는 없는 것이 된다.
<삼매>에 들기 위해 먼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한다.
<집중>을 이루는 <방안>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숨을 세는 <수식관>이 비교적 바람직하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호흡>을 센다.
이는 <의식>을 갖는 한 어떤 상태에서도 행할 수 있다.
한편, 이는 <몸>과 <뜻>을 함께 하나로 만드는 훈련도 된다.
몸에는 <뜻>을 기울여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손과 발의 동작]
또 반대로 <뜻>을 기울여도 뜻대로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예: 내장 기관]
그런데 <호흡>은 이 중간 영역이다.
숨은 평상시 자신이 <뜻>을 기울이지 않아도 쉴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이에 기울인다.
그러면 그 <뜻>에 따라 숨을 들이 쉬고 내 쉬게 된다.
따라서 이런 중간 영역에서 <삼매>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자신의 <뜻>과 <몸>을 하나로 할 수 있다.
처음 자신의 <들숨> <날숨>을 센다.
그런 가운데 이에 마음을 <집중>한다. [數息觀수식관, 持息念지식념]
그리고 <호흡>이 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음을 <들숨>과 <날숨>에 집중한다.
그리고 열까지 센다. [數息수식]
<수>를 세는 동안 오직 <숨>만 생각한다.
그리고 <숨>을 따라 생각을 머문다. [隨息수식]
예를 들어 <숨>이 들고 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멀리 이르는지 등을 생각한다.
열까지 헤아리는 동안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다시> 하나에서 열까지 차례로 헤아린다.
<숨>을 세는 동안 <숨>만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잡념>이 일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마침내 <삼매 상태>를 획득한 것이 된다. 【2】
처음 <초점을 맞춘 내용>에 <집중>을 이룬다.
그런 경우 <반사적>으로 이를 통해 <다른 내용>들은 의식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마음에서 <망집 번뇌> 등이 우선 제거된다. [사마타, 지]
그래서 <삼매>를 통해 기본적으로 <분노>와 <도거> 등의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악업>으로부터도 떠나게 된다. [靜慮律儀정려율의]
또 이런 수행을 통해 <몸가짐> 등이 저절로 <율의>에 들어맞게 된다.
그래서 <계체>(戒體)를 얻게 된다. [靜慮律儀정려율의 定共戒정공계]
한편, 이처럼 <집중된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마음의 <산란함>이 방지된다.
그러나 단지 <집중한 상태>로만 계속 머문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로 인해 <멍한 상태>가 되기 쉽다.
그래서 오히려 <졸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수면>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처음 집중된 이후 자신이 관찰하려는 <주제 내용>을 선택한다.
이는 관념 영역에서 그려내는 <관념>[想]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중된 상태에서 마음에 이런 <상>[想]을 떠올린다. [觀想관상]
그리고 <기존의 생각>과 바꿔 대치해 넣는다.
예를 들어 <4념처> 가운데 처음 몸을 관한다.
그런 경우 <몸> 가운데 발뼈에 처음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눈>을 통해 보이는 <감각현실>이 있다.
그리고 이를 대해 일정부분에 <상>(相)을 취한다.
그런 가운데 일으키는 <관념분별>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으로 <빛 광명>을 떠올려 그려낸다.
이는 제6의식 관념 영역에서 떠올리는 별도의 <관념내용>[想]이다.
이런 광명은 <감각현실>에 바탕해 상(相)을 취하여 일으킨 <관념>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관념>[想]을 관한다. [觀想관상]
그리고 이런 <관상(觀想) 수행으로 일으킨 관념>[想]으로 <기존 생각>을 대치해 넣는다.
그래서 <기존에 일으킨 관념>은 제거한다.
즉 <감각현실> 일정부분에 상을 취해 일으킨 <기존의 관념>은 제거한다.
이를 통해 처음 <욕계 망집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색계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후 <몸>과 <느낌>, <마음>, <법> 각 내용을 관해 나간다. [4념처의 경우]
그리고 이처럼 <집중된 상태>로 계속 임한다.
그리고 이후 이런 <각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세밀하게 두루두루 살펴 나간다.
예를 들어 문제되는 내용 <전체>와 <각 부분> 그리고 그외 <다른 부분>,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 관계> 등을 관한다.
그리고 그 <모습>과 <성품>, 그 <뼈대 골격> <힘>과 <작용>, <원인>과 <조건>, <결과>, <과보>, <본말> 등을 관한다.
그리고 끝내 그 <근본 실상>이 차별없이 얻을 수 없고 <공함>을 관한다. [10여시]
그런 가운데 <현실의 정체>를 <실상>을 꿰뚫어 올바로 파악한다. [思惟修사유수, 審正觀察심정관찰, 正思정사]
【주석】---
【1】 { K0570V15P0539c09L; 㝵何等爲五一貪欲蓋二瞋恚蓋三...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11권, 4) 삼마희다지(三摩呬多地) ①, 미륵보살설. 당 현장역(彌勒菩薩說. 唐 玄奘譯), K0570, T1579 }
【2】 { K0955V27P0619c13L; 論曰言息念者卽契經中所說阿那...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22권, 6.분별현성품(分別賢聖品)①,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삼매의 공덕
마음의 <집중>은 햇빛을 초점에 모으는 것과 같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은다.
그러면 종이도 태울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한 <초점>에 집중해 모은다.
그러면 산란한 상태와 달라진다.
이로써 다양한 <공덕>을 '끌어낸다'. [samāhita, 삼마희다三摩呬多, 등인等引]
예를 들어 사려 분별도 명확하게 행한다.
그리고 빠르게 행하게 된다.
그리고 6신통의 공덕도 끌어내게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4무량심을 주제로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복덕자량을 얻게 된다.
또 4념처나 연기 등을 주제로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지혜자량도 얻게 한다. 【1】
또한 삼매를 닦으면 <지혜>가 청정해진다.
그리고 적정하게 안정된다.
그래서 수승한 상태에 '이른다'. [samāpatti, 삼마발제三摩鉢提, 삼마발저三摩鉢底, 등지等至]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정한 주제>를 관한다. [관상觀想]
그러면 의식 상태는 욕계에서 <색계>와 <무색계>상태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 결과 <욕계의 고통>에서도 멀어진다.
그리고 다시 집중을 반복해간다.
그러면 점차 집중된 범위 밖 내용은 사라진다.
이를 통해 마음에 들어 있던 여러 번뇌를 끊는다. [피분열반彼分涅槃]
예를 들어 삼매를 통해 처음 탐욕ㆍ분노ㆍ혼침(惛沈)ㆍ도거(掉擧) 등을 벗어난다.
그리고 이후 말ㆍ색상(色想)ㆍ심(尋-거친 생각)ㆍ사(伺-세밀한 생각)ㆍ기쁨ㆍ즐거움 등의 번뇌도 끊는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 안의 실답지 않은 <망상 번뇌>를 끊는다.
그리고 번뇌를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마음 내용>을 제거한다.
그리고 <망식의 작용>도 끊는다.
그러면 점차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렇지만 이는 결정적(決定的)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삼매를 닦다가 삼매상태를 벗어난다.
그러면 다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는 궁극적 구경열반(究竟涅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삼매상태에서만 얻게 되는 <차별열반>(差別涅槃)이라 한다.【2】
그러나 삼매 수행을 바탕으로 이후 <반야 지혜>를 원만히 닦아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혜 보리 자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가운데 <근본 무명>을 제거한다.
그러면 <궁극적인 구경열반>(究竟涅槃)에 이르게 된다.
【주석】---
【1】만약, 정려에 의하여 자(慈) 등의 4무량을 수습한다면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정려를 복의 부분이라고 한다.
만약 정려로 앞의 정진 중에서 말한 바와 같은 온선교를 닦음에 의한다면
이와 같은 부류의 모든 정려를 지혜의 부분이라고 한다.
{ K0570V15P0766b18L; 靜慮修習慈等四種無量如是等類...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36권, 본지분중(本地分中) 보살지(菩薩地) 제 15 초지유가처(初持瑜伽處)의 자타리품(自他利品) 제 3의 나머지[餘], 미륵보살설. 당 현장역(彌勒菩薩說. 唐 玄奘譯), K0570, T1579 }
【2】 여러 가지 번뇌의 일부분[一分]을 끊기 때문에, 결정적(決定的)이지 않기 때문에 피분열반(彼分涅槃)이라고 이름한다.
구경열반(究竟涅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열반(差別涅槃)이라고 이름한다.
{ K0570V15P0542a22L; 名爲彼分涅槃亦得說名差別涅槃...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11권, 4) 삼마희다지(三摩呬多地) ①, 미륵보살설. 당 현장역(彌勒菩薩說. 唐 玄奘譯), K0570, T1579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삼매 수행의 내용
<삼매> 과정에서 <관찰할 주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신ㆍ수ㆍ심ㆍ법>과 <부정ㆍ고ㆍ무상ㆍ무아>의 내용도 있다. [4념처]
한편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사체가 부패하는 모습>을 관할 수도 있다. [9상, 부정관]
또한 다음의 8해탈도 있다.
♥Table of Contents
▣- 8해탈
8해탈은 내관(內觀)에 의한 <선정 방안>이다.
이를 통해 5욕(欲)을 일으키는 경계를 멀리한다. [背배]
그리고 <탐욕과 집착>을 버린다.[捨사]
이런 의미에서 이를 8배사(背捨)라고도 한다. [8背捨배사]
그리고 이를 통해 3계의 <번뇌>를 끊는다.
그리고 <번뇌의 묶임>에서 풀려나 벗어난다.[解脫해탈]
따라서 이를 <8해탈>이라고 칭한다. [8해탈八解脫]【1】
현실에서 눈을 뜨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통상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외부세상>이라 여긴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감각현실>[광의의 색色- 색,성,향,미,촉]으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을 가리키며 무엇인가라고 묻는다고 하자.
통상적으로 욕계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취해 일정한 내용이라 여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색(色)이라고 답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몸>은 내색, <나머지부분>은 외색으로 구분한다.
이는 일정한 관념분별[상想]을 바탕으로 일정부분에 상(相)을 취하는 상태다.
그러나 감각현실은 본래 관념이 아니다.
관념도 감각현실이 아니다.
단지 그런 감각현실을 대해 그러한 관념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신이 분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자신이 분별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 내용이라 여기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망상분별 상태다.
- 내 유색상 관외색 해탈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에 내색(内色)이 그처럼 있다고 여긴다 [有色想유색상]
그런 가운데 색(色)을 탐하며 집착한다. [色欲색욕]
이런 경우 방편상 죽은 <사체>를 마음으로 관념상 떠올린다.
이는 감각 행위가 아니다.
즉 사체를 찾아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마음에서 그런 내용을 상상해 떠올려 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체의 퍼렇게 어혈든[靑瘀청어] 모습 등을 관한다.[觀想관상]
이처럼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마음에 관념으로 떠올려 관한다.
그래서 <탐심>을 제거한다.
그래서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난다.[解脫해탈]
이를 <내 유색상 관외색 해탈>(內有色想觀外色解脫)이라 한다.
- 내무색상 관외색해탈
이제 두번째 단계는 다시 다음단계로 나아간다.
처음에는 일정한 관념분별[상想]을 바탕으로 일정부분에 상(相)을 취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에 색(色)이 그처럼 있다고 잘못 여긴다 [有色想유색상]
그러나 이후 마음을 집중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관념을 떠올린다. [심,수,심,법 등]
그리고 그렇게 떠올린 관념[想상]에 다시 집중한다.
그렇게 행하면 처음의 욕계의 망상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색계 정려의 상태에 들어간다.
그런 가운데 처음 색을 집착하고 탐내는 상태에서 벗어난다.
색이란 관념이 감각현실 부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망상분별이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망상분별을 떠난다.[無色想무색상]
그리고 다시 색(色)을 탐하는 집착을 제거해나간다.
그래서 사체의 퍼렇게 어혈든 모습 등 더러운 모습을 떠올려 계속 관한다.[觀想관상]
그래서 색에 대한 탐심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를 <내무색상 관외색해탈>(內無色想觀外色解脫)이라 한다.
한편, 탐심을 제거함에 처음 색의 더러운 모습을 관한다.[不淨觀부정관]
그러나 이러한 부정관(不淨觀)만 집착의 제거에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淨정]을 떠올려 관한다.[觀想관상]【2】【3】
그래서 이를 통해 삼매[定정]에 든다.
그래서 욕계에서 일으키는 색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정해탈(淨解脫)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해탈 상태를 몸[身신]으로 증득한다[作證작증].
그래서 해탈 상태를 완전하고 원만하게 갖추어[具足구족] 머문다 [住주].
이를 <정해탈 신작증 구족주>(淨解脫身作證具足住)라고 한다.
이후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끝내 색계에 대한 마음을 버린다.
이로써 무색계 삼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공무변처 해탈>(空無邊處解脫).
<식무변처 해탈>(識無邊處解脫).
<무소유처 해탈>(無所有處解脫).
<비상비비상처 해탈>(非想非非想處解脫).
<멸수상정 해탈 신작증구족주>(滅受想定解脫身作證具足住).
【주석】---
【1】 처음 두 가지 해탈은
3 번째 해탈은 다시 부정관(不淨觀)의 마음을 버린다. 그리고 등진다.
이후 4 가지 무색처의 해탈은 각기 바로 아래 지[下地]의 마음을 버린다. 그리고 등진다.
상수멸의 해탈은 온갖 소연이 있는 마음을 버리고 등진다.
그러므로 버리고 등진다는 뜻이 해탈의 뜻이다.
{ K0952V26P0639a06L; 名解脫解脫是何義荅棄背義是解...『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毗達磨大毘婆沙論), 제84권 2. 결온(結蘊) 4) 십문납식 ⑭, 오백대아라한등조. 당 현장역(五百大阿羅漢等造. 唐 玄奘譯), K0952, T1545 }
【2】 8해탈 중에서 앞의 세 가지는 무탐을 본질로 한다. 탐을 직접적으로 대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경 중에서 ‘……상관(想觀)……’이라고 설한 것은 ‘상’과 ‘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세 가지 해탈 중에 처음의 두 가지는 부정상(不淨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는 푸르죽죽한 어혈[靑瘀] 등의 온갖 행상을 짓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 해탈은 청정상(淸淨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청정한 빛의 선명한 행상을 짓기 때문이다.
{ K0955V27P0667a22L; 八中前三無貪爲性近治貪故然契經中說想觀者想觀增故三中初二不淨相轉作靑瘀等諸行相故
第三解脫淸淨相轉作淨光鮮行相轉故...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29권, 8.분별정품②,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3】 세 가지 해탈 중에 처음의 두 가지는 부정상(不淨相)으로 일어난다. 여기서는 푸르죽죽한 어혈[靑瘀] 등의 온갖 행상을 짓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 해탈은 청정상(淸淨相)으로 일어난다. 청정한 빛[淨光]의 선명한 행상을 지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 K0956V27P1349b16L; 初二不淨相轉作靑瘀等諸行相故 第三解脫淸淨相轉作淨...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제80권 8. 변정품 ④, , 존자중현조. 당 현장역(尊者衆賢造. 唐 玄奘譯), K0956, T1562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8승처
한편 삼매에는 다음의 8승처도 있다.
<내유색상 관외색소>(內有色想觀外色少)
<내유색상 관외색다>(內有色想觀外色多)
<내무색상 관외색소>(內無色想觀外色少)
<내무색상 관외색다>(內無色想觀外色多)
<내무색상 관외청>(內無色想觀外靑)
<내무색상 관외황>(內無色想觀外黃)
<내무색상 관외적>(內無色想觀外赤)
<내무색상 관외백>(內無色想觀外白)
이는 8해탈을 닦은 후, 명상에 숙달한 상태에서 행한다.
이는 자유자재로 부정(不淨)과 정(淨)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10변처
또 다음의 10변처도 있다.
지(地)ㆍ수(水)ㆍ화(火)ㆍ풍(風)ㆍ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ㆍ
공무변처(空無邊處)ㆍ식무변처(識無邊處)다.
이는 10가지 관법(觀法)이다.
즉, 6대(大)와 4가지 색[(顯色] 하나하나가 일체처(一切處)에 가득한 것으로 관한다.
♥Table of Contents
▣- 3삼매
한편 공, 무상, 무원무작의 3삼매도 있다. [3삼매三三昧, trayaḥ samādhayaḥ]
♥Table of Contents
▣- 공삼매
생사현실의 본바탕을 실재 또는 실상이라고 칭한다.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그 본바탕 실재는 사실은 공하다. [공空]
그래서 실재 영역에서는 그런 생사고통을 본래 얻지 못한다.
그리고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뼈대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무아無我]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 생사현실을 실답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 집착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생사현실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현실에서 일으키는 번뇌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경우 현실의 본바탕 실재의 정체를 관한다.
그리고 현실을 실재와 잘 대비해 살핀다.
그래서 실재가 공함을 잘 관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을 실재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
그리고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없음도 잘 관한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은 마치 꿈과 같음을 이해한다.
즉 현실은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집착을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먼저 실재가 공함을 관한다. [공삼매空三昧, śūnyatā-samādhi]
이 삼매는 4제법 가운데 고제의 공(空) ㆍ무아(無我) 2행상에 상응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공해탈문이라고 칭한다. [空解脫門]
♥Table of Contents
▣- 무상삼매
한편 현실에서 취하는 일체 형상이 잘못임을 관한다. [무상삼매無相三昧 animitta-samādhi]
이 사정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그는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상태에서 그에게 바위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한 관념[想]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일정부분을 바위로 여긴다.
그래서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즉 그는 그런 부분을 바위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바위 상(相)을 취한다.
처음 그가 얻게 된 전체 <감각현실> 내용이 있다.
이 경우 관념영역에서 그런 전체를 대하며 일부분을 마치 가위로 오려내 듯 취한다.
즉 그는 각 부분을 묶고 나눈다.
그런 가운데 일정 부분에 '바위'상(相)을 취한다.
그리고 그처럼 오려 취한 부분을 곧 그런 바위의 모습[상相]으로 여긴다.
현실에서 각 관념마다 이처럼 상(相)을 취해 임한다.
그런데 그렇게 취하는 각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각현실>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想]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想]이 '아니다'.
또 반대로 그런 관념[想 saṁjñā]에는 그런 <감각현실>[상相 lakṣaṇa]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대해 그런 관념[想]을 '일으킨 것' 뿐이다.
현실에서 그런 <감각현실> 부분[상相]과 생각[想]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가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상相]을 대한다.
그리고 일정한 생각[想]을 '일으킨다'
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想]을 그런 부분[상相]을 떠나 일으킨 것은 아니다.
즉, 그는 그런 관념을 다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위 부분을 대해 바위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일으킨다.
그러나 물을 대할 경우에는 바위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상相]과 생각[想]은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상相]을 대하여 일정한 생각[想]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그런 생각[想]을 바탕으로 일정한 부분[상相]을 그런 내용으로 여기고 대한다.
그리고 이후 그런 생각[想]은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부분[상相]을 취해 '가리키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에서 상호간에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감각현실> => ( 일으킴 ) => 관념[想]
관념[想] => ( 가리킴 ) => <감각현실>
현실에서 그처럼 일정 부분을 오려내듯 상[相]을 취한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취한 그 부분[상相]은 <감각현실>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대해 일으키는 생각[想]은 관념이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또 관념도 <감각현실>이 아니다.
따라서 그처럼 취한 부분[상相]에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想]이 본래 없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편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대해 일정한 관념[想 saṁjñā]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자신ㆍ생명ㆍ수명. 남ㆍ녀, 생ㆍ주ㆍ멸 등등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그에 대한 상을 찾아 취한다.
예를 들어 마음에서 연필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방에서 연필을 찾아 댄다.
이와 같다.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 a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a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a의 상'[상相]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런 a가 들어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곧 그런 a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갖는 부분'[상相]은 본래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런 사정을 기본적으로 잘 관한다. [무상삼매無相三昧]
현실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상相]이 있다고 여긴다.
이는 잘못된 망상 분별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잘못된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그런 관념이나 분별내용을 실답다고 여긴다.
즉 그런 관념분별[想]은 그런 <감각현실> 부분을 그처럼 실답게 내용으로 갖고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런 관념분별[想 saṁjñā]은 현실에서 그러그러한 일정 부분[상相]'이다'라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그런 관념분별을 실다운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그에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인다.
따라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망집을 잘 제거해야 한다.
한편, 현실에서 각 개인은 자신과 자신의 목숨, 생명에 가장 집착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집착은 이에 바탕해 일으킨다.
따라서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서 '그런 생각에 해당하는' [상相]을 본래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무상삼매無相三昧]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는다.
그러면 생사현실은 본래 자신이 생각하는 생멸을 떠난 상태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은 본래 생사고통을 떠난 상태임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삼매는 4제법 가운데 멸제(滅諦)의 멸ㆍ정ㆍ묘ㆍ리(滅靜妙離) 4행상에 상응한다.
한편 현실에서 그런 망상을 바탕으로 상(相 lakṣaṇa)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를 통해 현실에서 망상분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망집 번뇌의 묶임에서 해탈을 얻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를 무상해탈문이라고 칭한다. [無相解脫門]
* 이런 망상분별의 문제가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을 관련부분에서 반복해 살피게 된다.
[참고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킴]
[참고 ▣-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참고 ▣- 무상삼매 ]
[참고 ▣- 관념이 실답지 않은 사정 - 환자와 가족의 비유를 통한 이해]
♥Table of Contents
▣- 무원삼매
현실에서 망집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리고 온갖 쓸데없는 희망과 소원을 일으켜 추구한다.
그런데 그런 소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래 현실에서 얻을 수 없다.
모든 법의 본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
그러면 그런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관한다. [무원삼매無願三昧 apraṇihita-samādhi)]
그리고 이를 통해 망집에 바탕한 일체 소원을 다 제거한다.
그러면 그런 소원에 바탕해 행하던 행위도 함께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무원무작삼매(無願無作三昧)라고도 칭한다.
현실에서 일으키는 소원은 대부분 망집에 바탕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좋은 보석을 갖기를 원한다.
이 경우 그런 소원은 관념영역에서 일으킨다.
즉, 관념영역에서 평소 좋다고 여기는 내용을 이리저리 조합한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좋을 텐데...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것이 현실에서 각 주체가 갖는 소원이 된다.
그리고 그 소원을 추구하며 업을 행해나간다.
그런데 이런 관념은 그가 대하는 <감각현실>에서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감각현실> 일정부분을 대하면 반복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그런 관념내용으로 그런 일정부분을 '가리키게' 된다.
그런 가운데 다음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즉,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관념내용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더 나아가 그런 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다'라고 잘못 여긴다.
그러나 본래 그런 <감각현실>은 그런 관념이 아니다.
또한 관념도 그런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러나 망집에 바탕한 경우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을 서로 결합시켜 접착시켜 대한다.
그런 가운데 관념으로 일정한 소원을 갖는다.
이런 경우 이런 소원에는 공통적으로 다음 내용이 담긴다.
우선 일정한 관념으로 희망을 만들어 갖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보석을 갖기를 원한다.
그 상태에서 그가 생각하는 보석은 관념이다.
이런 내용은 물론 이미 그의 관념영역에 있다.
그런 가운데 단순히 그 관념을 다시 한 번 똑같이 일으킨다.
그렇다고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소원이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상태는 다음이다.
현실에서 각 주체는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래서 관념에 해당하는 상[相]을 <감각현실>에서 취한다.
그런 경우 소원에 해당하는 상[相]도 <감각현실>에 따로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감각현실>을 대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실이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를 소원이 성취된 것으로 여긴다.
현실에서 이처럼 일정한 관념으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가 현실에서 보석으로 여기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래서 손으로 가리키게 되는 <감각현실> 부분[상相]이 따로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부분[상相]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즉, 그는 그런 소원에 해당하는 <감각현실> 상태를 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보석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에게 보석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
그런 경우 그는 일정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
이는 그가 그런 부분에 그런 보석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그런 부분이 그런 보석'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런 보석으로 여기고 가리킬 그런 <감각현실> 내용을 원한다.
따라서 이처럼 망상분별에 바탕해 소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에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래서 <감각현실> 영역에서 그런 내용을 추구한다.
즉 그런 관념을 일으켜 얻을 <감각현실>을 찾아 구한다.
그런 결과 그런 <감각현실>을 얻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경우 그는 <감각현실>에서 그런 일정 부분[상相]을 취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해 다시 일정한 관념[想]을 일으킨다.
그래서 처음 가진 희망(관념)과 일치하는 관념을 얻는다.
이런 경우 자신의 원래 희망이 성취된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업을 행해 일정한 상태가 변화된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대해 보석이란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처음 소원내용과 일치함을 의식한다.
그런 경우 소원이 뜻대로 성취되었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추구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로써 괴로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념이 모두 관련된다.
그리고 문제된다.
그래서 관념은 현실의 고통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관련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잘못된 망상분별에 바탕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 각 부분[상相]과 관념[想]의 관계가 문제다.
이 각 경우 이들 분별은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이를 이미 앞 무상삼매에서 살폈다.
[참고 ▣- 무상삼매 ]
본래 그런 <감각현실>은 그런 관념이 아니다.
또한 관념도 그런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망상분별에 소원을 일으켜 갖는다.
그런 경우 그 소원 일체는 잘못된 망상분별에 바탕한다.
그래서 현실일체에 본래 그런 소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소원을 집착한다.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에 묶인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생사고통을 받아간다.
따라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해 일으킨 이들 소원일체를 제거해야 한다. [무원삼매無願三昧]
그리고 이를 통해 업을 중단한다. [무원무작해탈삼매]
그래야 생사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해탈을 얻는다.
따라서 무원무작삼매는 4제법 가운데 고제의 고(苦)ㆍ무상(無常)의 2 행상에 상응한다.
또 집제의 인ㆍ집ㆍ생ㆍ연(因集生緣) 4행상에 상응한다.
즉 현실 일체에서 소원에 해당한 내용을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런 사정으로 망집에 바탕해 대하는 현실 일체는 고(苦)ㆍ무상(無常) 상태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잘 깨닫고 관한다.
그러면 이로 인해 망집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생사 묶임에서 해탈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무원무작 해탈문이라고도 칭한다. [無願無作解脫門]
3삼매와 3해탈문은 이처럼 서로 관련된다.
여기에서 번뇌를 낳는[유루有漏] 정(定) 상태는 3삼매라 칭한다. [3삼매 trayaḥ samādhayaḥ]
번뇌를 제거해 낳지 않은[무루無漏] 정(定)은 3해탈문이라고 구분한다. [3해탈문 tṛīṇi vimokṣa-mukhāni] (『대승의장』 권13)
♥Table of Contents
▣- 4무량심
삼매의 주제는 4무량심 내용도 있다. [사무량심四無量心 catvāri-apramāṇacittāni]
이는 자ㆍ비ㆍ희ㆍ사의 무량심을 뜻한다. [자慈 maitrī ㆍ비悲 karuṇāㆍ희喜 muditāㆍ사捨 upekṣā]
생명들에게 널리 올바른 선과 지혜, 즐거움과 이익을 베푼다.
반대로 악과 어리석음, 고통과 손해를 덜어준다.
그리고 악하고 어리석고 고통 받는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따라 슬퍼한다.
그리고 이를 구제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선한 일과 수행의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
한편 생명을 널리 원(怨)ㆍ친(親)의 구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그리고 가치 없는 일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집착을 버린다.
이런 4무량심을 주제로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이는 복덕자량을 쌓는 행이 된다.
특히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자.
이런 경우 이는 중요한 삼매 주제가 된다.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가 색계 4선과 무색계 4선을 증득한다.
그러면 색계 무색계에 태어난다.
그런 경우 중생제도가 힘들게 된다.
색계 무색계는 수명이 장구하다.
그리고 당장은 생사고통의 문제가 멀다.
따라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는 방편상 이런 상태를 증득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중생제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삼매를 닦아야 한다.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가 색계 4선과 무색계 4선을 닦는다.
이런 경우 중간에 4무량심을 주제로 삼매를 닦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유하면 다음과 사정이 같다.
어떤 이가 잠을 든다.
그러면 다음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전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잠을 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냥 잠에 빠지기 쉽다.
이와 사정이 같다.
♥Table of Contents
▣- 제불현전삼매
한편, 삼매 수행시 부처님을 념하여 관할 수도 있다. [념불관]
예를 들어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에 반주삼매[般舟三昧 pratyutpanna-samādhi)가 나온다.
이는 제불현전삼매(諸佛現前三昧) 또는 불립삼매(佛立三昧)라고도 한다.
이는 수행을 통해 현재 눈앞에 모든 부처님을 관하는 삼매다.
이를 통해 부처님을 본받아 수행에 정진해갈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외 삼매의 주제 자체는 무량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유롭게 주제를 택해 삼매를 닦을 수 있다. [7각지의 택법]
중국 선종에서 수많은 화두나 공안을 들어 선정을 닦는 것도 이에 준한다.
♥Table of Contents
▣- 다양한 삼매
삼매는 관찰하는 주제,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제거되는 번뇌나 특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전에는 다양한 삼매가 나열된다.
삼매 명칭은 삼매의 주제에 따라 붙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인삼매, 화엄삼매, 무량의삼매 등과 같다.
또는 그 삼매의 강도에 따라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금강삼매, 여금강삼매 등과 같다.
한편 삼매의 방식이나 특징 또는 지위에 따라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매 중에 심[尋]과 사[伺]의 있고 없음에 따라 3삼매를 구분하기도 한다.
심[尋]은 각[覺]이라고도 한다. 이는 거친 대강의 생각을 가리킨다.
한편 사[伺]는 관[觀]이라고도 한다. 이는 세밀하게 살피는 생각을 가리킨다.
그래서 유각유관삼매(有覺有觀三昧)ㆍ무각유관삼매(無覺有觀三昧)ㆍ무각무관삼매(無覺無觀三昧) 등을 나열한다.
한편, 정(定)ㆍ혜(慧)를 겸하여 닦는가에 따라 3삼매를 나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분수삼매(一分修三昧)ㆍ공분수삼매(共分修三昧)ㆍ성정삼매(聖正三昧) 등을 나열한다.
이 가운데 정(定) 또는 혜(慧)의 어느 하나만을 닦는 것이 일분수삼매다.
정(定)ㆍ혜(慧)를 겸하여 닦는 유루정(有漏定)이 공분수삼매다.
정(定)ㆍ혜(慧)를 겸하여 닦는 무루정(無漏定)을 성정삼매라 칭한다. (『성실론』 권12)
또 정(定)의 성질(性質) 여하에 따라서 미정(味定)ㆍ정정(淨定)ㆍ무루정(無漏定)의 3정[三定, 3등지三等至]로 나눈다.
미정(味定)은 탐애(貪愛)와 상응하여 삼매의 공덕에 애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미등지味等至 āsvādana-samāpatti)]
정정(淨定)은 유루(有漏)의 탐욕없는 선심(善心)과 상응(相應)한 경우를 가리킨다. [정등지淨等至 śuddha-samāpatti]
무루정(無漏定)은 이를 의지해 번뇌를 끊고 무루지(無漏智)를 얻는 경우를 가리킨다. [무루등지無漏等至 anāsrava-samāpatti]
삼매를 행하는 자세에 따라 다음을 나열하기도 한다.
상좌(常坐)ㆍ상행(常行)ㆍ반행반좌(半行半坐)ㆍ비행비좌(非行非坐)삼매
삼매를 행하는 주체와 그 특징으로 다음처럼 4종선을 나열하기도 한다.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ㆍ관찰의선(觀察義禪)ㆍ반연진여선(攀緣眞如禪)ㆍ제여래선(諸如來禪).
우부소행선은 성문(聲門)이나 외도가 인무아(人無我)를 알고 닦는 선이다.
그래서 무상(無常)ㆍ고(苦)ㆍ부정(不淨)의 상(相)을 관하여 무상멸정(無相滅定)에 이르는 선을 가리킨다.
관찰의선은 보살이 인무아ㆍ법무아(法無我)와 모든 법의 성품없음[無性]과 그 밖의 이치들을 널리 관찰하는 선이다.
반연진여선은 사려(思慮)나 분별을 넘어, 있는 그대로 진여(眞如)를 깨닫는 선이다.
그래서 인무아ㆍ법무아라는 생각마저 일어나지 아니하는 선을 가리킨다.
제여래선은 여래(如來)의 깨달음에 들어가 법락(法樂)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사의(不思議)한 작용을 나타낸다. (『대승입능가경』 권3)
이외에도 경전에는 수많은 삼매가 나열된다.
예를 들어 수능엄삼매, 삼매왕삼매, 사자분신삼매 등등이다.
♥Table of Contents
▣- 삼매의 단계
삼매과정에서 삼매 수행에 따른 집중이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점차 끊어가게 되는 번뇌가 달라진다.
그래서 다양한 단계가 시설된다. [색계 4선, 무색계 4선, 멸진정 등]
♥Table of Contents
▣- 색계 4선
색계 선정은 삼매 각 단계의 깊이에 따라 다음처럼 특징을 구분한다.
♥Table of Contents
▣- 초선(初禪)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
초선에서는 근심, 걱정[憂]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욕탐(欲貪)ㆍ분노ㆍ해침의 3가지 심(尋)ㆍ사(伺), 계율을 범함, 산란함을 다스린다.
초선은 심(尋 거친 생각)ㆍ사(伺, 세밀한 고찰)ㆍ기쁨[희喜]ㆍ즐거움[낙樂] ㆍ삼매[등지等持, 정)의 요소를 갖는다.
♥Table of Contents
▣- 2선(二禪)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
제 2선에서는 심(尋)ㆍ사(伺)ㆍ고(苦) 등을 여의고 다스린다.
그리고 안의 평등하고 깨끗함[內等淨]ㆍ기쁨[喜]ㆍ즐거움[樂]ㆍ삼매[等持]의 요소를 갖는다.
♥Table of Contents
▣- 3선(三禪)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
제 3선에서는 기쁨[喜]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다스린다.
그리고 평등하게 버림을 행함[행사行捨]ㆍ올바른 기억[정념正念]ㆍ올바른 지혜[정혜正慧]ㆍ즐거움을 느낌[수락受樂]ㆍ삼매[等持]의 요소를 갖는다.
♥Table of Contents
▣- 4선(四禪) 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
제 4선에서는 즐거움[樂]의 묶임 등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평등하게 버림의 깨끗함[행사청정行捨淸淨]ㆍ기억의 깨끗함[념청정念淸淨]ㆍ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느낌[비고락수非苦樂受]ㆍ삼매[等持]의 요소를 갖는다.
♥Table of Contents
▣- 심(尋)과 사(伺)의 유무에 따른 분류
삼매는 각 단계에서 심(尋)ㆍ사(伺)의 유무에 따라 다음처럼 분류하기도 한다.
먼저 여기에서 심(尋)과 사(伺)의 자세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가사지론』 권5에 의하면, 심과 사 둘은 모두 사(思)와 혜(慧)의 일부분을 그 본체로 한다.
심(尋)ㆍ사(伺)는 낱말[명신名身]ㆍ문장[구신句身]ㆍ음소[문신文身]에 의한 의미를 대상으로 한다.
찾아 구하고[심구] 찾아 살피는 것[사찰]이 그 행위의 모습이다.
심(尋)ㆍ사(伺)는 말[語言]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모든 심(尋)ㆍ사(伺)는 반드시 분별(分別)에 해당한다.
그러나 분별은 심사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또한 이런 심사는 욕계 6도 각각과 초선상태에 걸쳐 작용한다. (『유가사지론』 권5)
한편 『유가사지론』 권 33에서는 삼매 상태의 심사에 대해 다음처럼 설명한다.
삼매 상태에서 연(緣)에 대하여 맨 먼저 갑자기 일어난다.
그리고 문득 대상[경境]에 바삐 급하게 지어지는 거친 뜻과 말의 성품[의언성意言性]을 심(尋)이라고 한다.
그리고 곧 그 연에 대하여 그에 따라 일어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한다.
그리고 대상[경]을 천천히 겪으면서 지어지는 미세한 뜻과 말의 성품을 사(伺)라고 한다.
若在定地於緣最初率爾而起 悤務行境麤意言性是名爲尋
卽於彼緣隨彼而起隨彼而行徐歷行境細意言性是名爲伺
...
한편 『입아비달마론』 권상에 의하면
심(尋: vitarka)은 대상에 대해 마음으로 하여금 거칠게 추구하게 하는 심리작용이다.
분별(分別) 사유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伺: vicāra)는 대상에 대해 마음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추구하게 하는 심리작용이다.
이를 쉽게 이해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바위에 대해 생각을 한다.
처음에는 단지 바위란 말 자체나 바위에 대한 대강의 모습 정도만 떠올려 생각한다.
그런 다음, 점차 바위의 모습, 성품, 바위의 각 부분, 전체와의 관계, 원인, 결과...등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나간다.
그래서 이런 정신작용을 심(尋) 사(伺)라고 각기 구분해 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욕계(欲界)와 색계(色界)의 초정려(初靜慮) 단계는 이 심과 사의 작용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는 유심유사(有尋有伺)삼매에 해당한다. [유각유관정有覺有觀定]
한편 제2정려(第二靜慮)에 들어가는 예비단계[近分定]가 있다.
그런데 초정려와 이 예비단계 사이의 중간단계를 다시 중간정(中間定)이라고 칭한다.
이를 닦으면 대범천(大梵天)에 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단계는 심(尋) 작용은 사라진다.
그리고 사(伺) 작용만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는 무심유사(無尋唯伺) 삼매에 해당한다. [무각유관정無覺有觀定]
한편, 제2선에 들어가는 단계[近分定]이후는 심과 사의 작용이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제2선 근분정 이후부터 무색계(無色界) 정까지는 모두 무심무사(無尋無伺) 삼매다. [무각무관정無覺無觀定]
♥Table of Contents
▣- 현법락주
색계 삼매 수행을 닦는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 법락을 느낀다.
그리고 안주(安住)함을 얻게 된다. [현법락주現法樂住]
자기를 이롭게 하고 그의 마음은 지극하게 적정해진다.
탐애를 멀리 여읜다.
모든 생명[有情]을 해침이 없고 괴롭힘이 없다.
이로써 다른 이를 이롭게 한다.
또 이로 인해 장차 오는 세상에서 색계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생정려]
예를 들어 초정려에 범중천 등 3천이 있다.
범중천梵衆天(Brahma-pāriṣadya)
범보천梵輔天(Brahma-purohita)
대범천 大梵天(Mahā-brahman).
그리고 제2정려에 소광천 등 다음 3천이 있다.
소광천少光天(Parīttābha),
무량광천無量光天(Apramāṇābhā),
극광정천極光淨天(Ābhāsvara)
또 제3정려에 소정천 등 다음 3천이 있다.
소정천少淨天(Parītta-śubha),
무량정천無量淨天(Apramāṇa-śubha),
변정천遍淨天(Śubha-kṛtsna).
제4정려에 무운천 등 8천이 있다
무운천無雲天(Anabhraka),
복생천福生天(Puṇya-prasava),
광과천廣果天(Bṛhat-phala),
무번천無煩天(Avṛha),
무열천無熱天(Atapa),
선현천善現天(Sudṛśa),
선견천善見天(Sudarśana),
색구경천色究竟天(Akaniṣṭha).
이들이 색계 하늘이다.
♥Table of Contents
▣- 무색계 4선
색계4선을 닦는다.
그리고 이후 더욱 삼매에 집중한다.
그러면 무색계정 상태로 들어간다.
먼저 색상(色想)을 여읜다.
그래서 의식에 허공만 끝없이 펼쳐진 상태로 임한다.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ākāśānantyāyatana]
이후 앞 단계의 허공상(空想)을 여읜다.
그리고 식(識)만 끝없이 펼쳐진 상태로 임한다.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vijñānānantyāyatana]
이후 다시 식무변(識無邊)의 상(想)을 여읜다.
그리고 의식에 있는 바가 없는 상태로 임한다.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ākiñcanyāyatana]
이후 무소유(無所有)의 상(想)을 여읜다.
그리고 의식이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상태로 임한다.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naiva-saṃjñānāsaṃjñāyatana]
♥Table of Contents
▣- 멸진정과 9차제정
무색계 4선에서 비상비비상처정에 이른다.
이후 더욱 집중해 나간다.
그러면 느낌[受]과 생각[想]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된다.
이를 멸수상정(滅受想定, 멸진정)이라고 칭한다.
수행자가 각 단계를 차례차례로 들어서 최종적으로 멸수상정(滅受想定, 멸진정)까지 들어간다.
이를 9차제정이라고 칭한다.
각 단계를 이어 옮겨감에 있어 사이에 다른 생각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끝내 멸수상정(滅受想定)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일체 망식의 작용을 멈추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삼매의 구극점에 도달한다.
이를 연선(鍊禪)이라고도 칭한다.
마치 금을 단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는 뜻이다. [구차제정九次第定, navānupūrva-samāpattayaḥ]
삼매 수행의 단계가 깊어진다.
그럴수록 그 이전 단계의 번뇌와 장애를 여읜다.
그런 가운데 단지 비고락수(非苦樂受)와 삼매(等持, 정)의 요소를 갖는다.
즉, 사(捨, 평정)와 심일경성(心一境性)의 두 선정 요소만 있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사자분신삼매와 초월삼매
삼매수행을 닦아 삼매에 자재하게 된다.
그러면 각 단계를 차례대로 간격없이 신속하게 들고 날 수 있다.
이를 사자분신삼매라고 칭한다. [사자분신삼매師子奮迅三昧, siṃha-vijṛmbha-samādhi ]
삼매는 반드시 차례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닦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삼매수행을 닦아 삼매에 자재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각 단계를 뛰어 넘어 높은 단계의 정(定)을 들고 나며 닦을 수도 있다.
이를 초월삼매(超越三昧)라고 칭한다.
♥Table of Contents
▣- 삼매의 다양한 표현
경전과 논서에 삼매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번역에 따른 사정도 있다.
여하튼 이런 사정으로 삼매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래서 이들 표현을 놓고 많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본래 삼매는 정신적 수행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런 가운데 마음으로 닦는 수행의 각 상태를 언어로 표현한다.
이 경우 이런 표현만으로 각 내용을 뚜렷이 구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각 표현은 어느 정도 각기 특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표현은 수행자가 삼매를 닦아 나가는데 대강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수행자는 실제 삼매를 닦아가며 그 구체적 내용을 스스로 찾고 증득해갈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삼매와 관련해 다양한 표현이 제시된다.
그 사정은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이가 공을 던진다. 그래서 유리가 깨졌다.
이런 상황을 놓고 생각해보자.
이를 처음 공을 던지는 기본자세 측면에서 대할 수 있다.
또 공을 던지는 과정에서 그가 생각한 취지나 내용 측면에서 대할 수도 있다.
한편 그 공이 향하는 대상 측면에서 이를 대할 수도 있다.
또 공을 던짐으로서 대신 하지 않게 된 여타 내용 측면에서 이를 대할 수 있다.
또 그 공이 던져진 결과의 측면에서 이를 대할 수도 있다.
또는 그 공이 던져져서 이후 발생하는 여타 효과 측면에서 이를 대할 수도 있다.
상황은 하나다.
그러나 이를 살피는 측면은 이처럼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
삼매와 관련된 여러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다.
여러 표현을 범어 원어를 기준으로 번역 표현을 함께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이 각 표현에 대해 사전적 설명을 간략하게 붙인다.
각 표현은 그 의미하는 내용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즉, 욕계의 산란한 상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무심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 유심 무심의 구별은 제6식의 활동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무심위는 수면상태ㆍ기절한 상태[민절위悶絶位]ㆍ무상정(無想定)ㆍ무상생(無想生)ㆍ멸진정(減盡定)ㆍ무여열반(無餘涅槃) 등의 상태를 말한다.
무심정(無心定)에는 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의 2무심정(無心定)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제1~6식 범위의 심(心)ㆍ심소(心所)가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무상정은 범부 및 외도가 닦는 경우다.
그래서 무상(無想) 상태를 참된 깨달음으로 오인(誤認)하여 닦는 경우다.
멸진정은 성자(聖者)가 정(定)으로 무여(無餘) 열반의 적정(寂靜)을 닦는 경우다.
♥Table of Contents
▣- samādhi
samādhi 는 번역상 다음과 같은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다.
정(定)ㆍ삼매(三昧)ㆍ정사(正思) / 등지(等持)ㆍ삼마제(三摩提)ㆍ삼마제(三摩帝)ㆍ삼마지(三摩地)ㆍ정정(正定)ㆍ조직정(調直定)ㆍ정심행처(正心行處).
일정한 대상에 대해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자세하고 바르게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심일경성心一境性, 심정관찰審正觀察]
이는 정(定)의 체(體)로 본다.
이는 산란한 상태ㆍ집중[定]상태ㆍ유심위에 통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3계에 통한다고 제시한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삼매(三昧=正思)와 삼마제(三摩提=三摩地=等持)를 구분한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번역상의 표현차이로 본다.
♥Table of Contents
▣- cittaikāgratā
질다예가아갈라다(質多翳迦阿竭羅多)ㆍ심일경성(心一境性).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모아 선정(禪定)에 드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定)의 자성(自性)으로 본다.
『금강삼매경론』에서는 다음같이 제시한다.
이는 산란한 마음에는 통하지 않는다. 욕계의 방편심에만 통한다.
♥Table of Contents
▣- samāhita
삼마희다(三摩呬多)ㆍ등인(等引).
등(等)은 혼침(惛沈)ㆍ도거(掉擧)를 여의어 마음을 평등케 함이다.
인(引)은 모든 공덕을 일으킴을 뜻한다.
유심 무심에 통한다. 다만 산란한 상태는 제외한다.
♥Table of Contents
▣- samāpatti
삼마발제(三摩鉢提)ㆍ삼마발저(三摩鉢底)ㆍ등지(等至).
등(等)은 혼침(惛沈)이나 도거(掉擧)를 떠나 심신이 평온하게 안정된 상태를 뜻한다.
이런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하므로[지至] 등지라 한다.
이는 정(定)의 자상(自相)으로 본다.
유심 무심에 통한다.
다만 산란한 상태는 제외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삼마희다보다 더 범위가 좁다고 제시한다.
공(空)ㆍ무상(無相)ㆍ무원(無願) 3삼매에 통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 śamatha
사마타(奢摩他)ㆍ지(止)ㆍ정수(正受)ㆍ지식(止息)ㆍ적정(寂靜)ㆍ능멸(能滅).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망념(妄念)을 쉬는 것을 뜻한다.
유심(有心)의 정정(淨定)에 한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사마타는 심일경성 측면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다만, 사마타를 심일경성을 통해 반사적으로 망념 등이 제거되는 측면으로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마타가 행해지는 기본 영역은 심일경성 영역과 같다.
즉 욕계에서 심일경성을 닦는다고 하자.
그러면 욕계 영역 범위에서 사마타도 행해진다.
다만 구체적 대상만 차이가 있다.
심일경성을 A를 대상으로 행한다.
그러면 A 이외의 것이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dhyāna
태연나(駄演那)ㆍ선(禪)ㆍ선나(禪那)ㆍ선정(禪定)ㆍ정려(靜慮)ㆍ사유수(思惟修)ㆍ기악(棄惡)ㆍ공덕총림(功德叢林).
마음을 산란하지 않도록 통일한다.
그래서 고요하게 진리를 명상하는 것을 뜻한다.
색계(色界)의 4근본정(根本定)이 지[止 사마타奢摩他]와 관[觀 비발사나毘鉢舍那]이 균등하다.
따라서 이를 정려(靜慮)라 부른다.
유루무루ㆍ유심ㆍ무심위에 통한다.
이는 사유에 의미를 둔다.
따라서 무색계정은 제외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다음같이 제시한다.
이는 욕계에 통하지 않는다.
경안[輕安]에 들어가는 경지만 통한다.
그리고 삼마희다와 범위와 같은 것으로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 dṛṣṭa-dharma-sukha-vihāra
현법락주(現法樂住)
일체의 망상을 여읜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 법락을 느낀다.
그리고 안주(安住)함을 얻음을 뜻한다.
색계(色界)의 4근본정(根本定)에 한정한다.
각 표현이 가리키는 범위를 다음처럼 대강 표시해보기로 한다.
다만 각 입장에 따라 구체적 의미 범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를 감안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욕계산란】【욕계】【색계_______________】【무색계】|【무심 상태 】
【유루】
========================================
【○ ______】【○___】【○ samādhi______】【○_____】|【X__________】 : 산(散)ㆍ정(定)ㆍ유심위, 3계에 통한다.
【X _______】【○ __】【○ cittaikāgratā_】【○_____】|【○_________】 : 삼매의 본질, 단, 산란한 마음에는 통하지 않는다. 욕계의 방편심에만 통한다.
【X _______】【X __】【○ samāhita______】【○_____】|【○_________】 : 유심 무심 -다만 산위, 욕계는 제외
【X _______】【X __】【○ samāpatti_____】【○_____】|【○_________】 : 유심 무심 -다만 산위 욕계는 제외 - 공(空)ㆍ무상(無相)ㆍ무원(無願) 3삼매에 통하지 않는다.
【X _______】【○__】【○ śamatha______】【○______】|【X__________】 : 유심(有心)의 정정(淨定) - 사마타는 심일경성 측면에는 통하지 않는다.
【X _______】【X __】【○ dhyāna________】【X______】|【○_________】 : 유루무루, 유심무심 -무색계는제외, + 욕계에 통하지 않는다. 경안[輕安]에 들어가는 경지만 통한다.
【X _______】【X __】【○ dṛṣṭa-d~s~v~】【X______】|【X__________】 : 색계(色界)의 4근본정(四根本定)에 한함
♥Table of Contents
▣- 삼매로 분별 및 수ㆍ상ㆍ행ㆍ식을 제거해가는 사정
삼매를 닦는다.
이 경우 단계가 깊어질수록 다양한 망집 번뇌를 제거해가게 된다.
처음 말ㆍ색상(色想)ㆍ심(尋-거친 생각)ㆍ사(伺-세밀한 생각)ㆍ기쁨ㆍ즐거움 등을 제거해간다.
이후 무색계 멸진정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식ㆍ행ㆍ수ㆍ상도 점점 없어지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는 세간 입장과는 반대방향이다.
세간에서는 더 많이 감각하고 분별하려 한다.
그래서 삼매의 이런 방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다음 사정 때문이다.
생사현실에서 생사 고통을 겪게 된다.
수행은 이런 생사고통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사 묶임에서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생사고통을 받는 데에는 일정한 인과 관계가 있다.
즉,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처음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겪는다.
특히 3악도의 생사고통은 욕계 상황에서 문제된다.
욕계는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즉 현실에서 상을 취한다.
그리고 소원을 일으켜 추구한다.
그런 바탕에서 업을 행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뜻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현실이 뜻과 일치한다고 하자.
그러면 만족을 얻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만 불쾌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한편, 각 주체는 뜻에 맞는 상태에 희망을 그려간다.
그러나 뜻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걱정 두려움을 갖는다.
이런 사정으로 욕계에는 6도의 상태가 있게 된다.
그리고 3악도의 생사고통은 이런 상태에서 겪는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망상분별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근본 상황을 떠나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세계의 의미와 욕계 색계 무색계
수행자가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일단 욕계의 상황을 떠나게 된다.
욕계(欲界)에서 삼매[定]의 상태를 얻으려 한다.
그러면 수행(修行)이 필요하다.
이를 수득정(修得定)이라고 한다.
그 단계에 따라 색계 4선은 정정려(定靜慮)라고 한다.
무색계 4선은 정무색(定無色)이라고 부른다.
현실은 욕계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런 삼매에 들면 욕계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색계ㆍ무색계에 들게 된다.
그런데 삼매를 행하는 수행자를 옆에서 관찰한다.
이 경우 외관상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수행자를 여전히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구분을 하는지 의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수행단계와 관련된다.
그래서 그 사정을 살피기로 한다.
우선 계의 의미에 대해서 쉽게 파악해보자.
현실에서 눈으로 인식하는 영역을 안식계라고 칭한다.
색깔과 형체[色境]를 눈[眼根]에 의존하여 시각[眼識]으로 인식한다.
한편 귀로 인식하는 영역은 이식계라고 칭한다.
또 코로 인식하는 영역은 비식계라고 칭한다.
또 혀로 인식하는 영역은 설식계라고 칭한다.
또 몸으로 인식하는 영역은 촉식계라고 칭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주체가 눈을 감은 상태로 생활한다고 하자.
그러면 안식계는 내용이 맺히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그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귀나 코ㆍ혀ㆍ몸에 의존한 <감각현실>은 그대로 얻는다.
그러나 여하튼 그 주체가 얻어 들이는 내용은 이전과는 달라진다.
이 경우 그의 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또 눈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뜬다.
그러면 이전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삼매에 의한 욕계ㆍ색계ㆍ무색계의 이동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선 한 주체가 세계라고 평소 이해하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풍광을 내려본다.
또는 밤에 하늘을 보고 별을 헤아려 본다.
또는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본다.
또는 현미경을 구해 사물을 살펴본다.
이런 각 경우 각 주체는 평소 무엇을 세계라고 여기는가를 살펴보자.
각 경우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를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세상으로 여기고 대한다.
그가 이해하는 외부세계는 그런 것이다.
즉, 그는 그가 얻어낸 그런 내용을 평소 세계로 여기고 부른다.
나머지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다.
평소 귀고 듣거나, 코로 맡거나, 혀로 맡거나, 몸으로 느낀다.
이들 내용도 마찬가지다.
즉, 안ㆍ이ㆍ비ㆍ설ㆍ신을 통해 색ㆍ성ㆍ향ㆍ미ㆍ촉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느낌ㆍ생각ㆍ업(의업ㆍ구업ㆍ신업)ㆍ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자신이 얻어내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 주체가 세계라고 이해하는 내용은 곧 이들 내용이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하나의 구분된 영역이 된다.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을 '광의'의 색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수ㆍ상ㆍ행ㆍ식은 통상 명 또는 비색, 무색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색계와 무색계는 기본적으로 이들을 재료로 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욕계는 무엇인가를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망집과 욕계
현실에서 어떤 아이가 게임이나 만화나 영화에 빠진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가상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특성이 추가된다.
그래서 이를 게임계나 만화계, 영화계라고 부를 수 있다.
욕계도 마찬가지다.
처음 한 주체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얻는다.
그런데 이들을 기본재료로 망집을 일으킨다.
그러면 망집을 바탕으로 상을 취하고 임한다.
그리고 망집을 바탕으로 소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추구하며 업을 행한다.
그런 가운데 망집을 바탕으로 계속 임한다.
그래서 이를 욕계라고 칭하게 된다.
이 상황을 다음처럼 이해해보자.
현실에서 어떤 이가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을 대한다.
그러면 그는 그 상황에서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이후 그가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반대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들 각 내용은 다음 관계를 갖는다.
<감각현실> => ( 일으킴 ) => 관념[想]
관념[想] => ( 가리킴 ) => <감각현실>
이 때 그가 가리키는 부분은 그가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또한 관념도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는 그가 생각하는 관념이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감각현실> 부분은 그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다'.
무상삼매를 살필 때 이들 내용을 이미 살폈다.
[참고 ▣- 무상삼매 ]
그런데 욕계는 오히려 바로 이런 망상분별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상을 취해 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을 꽃이라고 여긴다.
그런 경우 그에게 꽃이 지금 어디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찾는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꽃으로 여기며 손으로 가리킨다.
이는 그 일정부분이 곧 그런 꽃'이다'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그 일정부분에 그런 꽃이 들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런 생각[想]을 바탕으로 그런 일정부분에 꽃의 상[相]을 취하는 현상이다.
한편 손으로 일정 부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반대로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러면 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바위라고 답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일정 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바위'란 생각[想]을 일으킨다.
그리고 곧 그런 부분이 '바위'다라고 여긴다.
이 역시 그런 생각[想]을 바탕으로 그런 일정부분에 바위의 상[相]을 취하는 현상이다.
이는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현실에서 이처럼 일정한 분별[想]을 바탕으로 일정한 부분에 상을 취해 임한다.
이는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즉, 그런 부분에는 그가 생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또 그 부분은 그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생각한다.
그렇게 상을 취한 부분을 대한다.
그 경우 그는 그 부분에 그가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그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생활해간다.
그리고 한 주체는 그런 가운데 소원을 일으켜 갖는다.
이 경우 그런 희망은 관념영역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좋다고 보는 내용을 떠올린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그런 내용이 얻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만약 그런 좋은 상태가 된다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마음 상태가 희망을 갖는 상태다.
그런데 그 희망이 성취되었다고 여기는 상태는 다음이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좋은 자동차를 갖기를 원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동차로 여기고, 가리키게 되는 부분[상相]이 따로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부분[상相]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업을 행한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에 이후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욕계에서 희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형태다.
즉 욕계는 이런 상태로 희망을 추구하는 세계다.
♥Table of Contents
▣- 욕계의 망상분별과 3악도의 생사고통
욕계는 망집에 바탕해 상을 취해 임한다.
그런 바탕에서 희망을 추구한다.
이런 것이 욕계의 특징이 된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여러 조건에 의존해 나타난다. [의타기상]
그런데 희망은 이와 별개로 관념영역에서 일으킨다.
이 둘은 그래서 서로 늘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감각현실>은 때로는 희망에 들어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사정으로 욕계에는 3악도가 나타나게 된다.
현실이 뜻에 들어맞는다.
그러면 좋음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된다.
또 좋은 뜻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희망과 의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주로 이런 상태만 오가며 지낸다고 하자.
그러면 하늘의 상태가 된다.
그러나 반대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다양한 고통과 공포, 두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주로 고통과 공포 두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지옥 상태가 된다.
한편, 당장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장차 희망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고통과 희망을 갈구하는 상태를 오가며 지낸다고 하자.
그러면 아귀의 상태가 된다.
한편, 당장 뜻대로 성취해 만족을 얻는다.
그런데 장차 원하지 않는 과보를 받을 것을 예상한다.
그래서 당장의 만족과 두려움을 오가며 지낸다고 하자.
그러면 아수라의 상태가 된다.
한편 이런 일체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에 바탕한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에 바탕해 계속 헤매 돈다.
그러면 축생의 상태가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혜를 갖춘다.
그러면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상태 가운데 우선 3악도가 당장 문제다.
생사고통을 극심하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생명은 생사윤회과정에서 이런 욕계 6도 상태에 들어 생사를 받아 나가게 된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묶인 3계 6도 전체가 함께 바람직하지 않다.
생사고통과 공포 두려움 등은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생사 묶임에서 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수행목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욕계의 산란 상태
현실에서 한 주체가 초점을 맞추어 임한다. [작의作意 Manaskāra]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망상분별에 바탕해 상을 취한다.
그리고 욕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다른 부분에 초점을 옮긴다.
그러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해 또 역시 상을 취한다.
예를 들어 그 다른 부분은 꽃이라고 분별을 일으킨다.
이 역시 망상분별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다른 부분에 초점을 옮긴다.
그러면 또 앞 상황을 반복한다.
즉, 초점을 맞춘 부분에 상을 취한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에 대해 분별을 일으킨다.
이처럼 계속 상을 옮겨 취한다.
그리고 그 때마다 그에 따라 망상분별을 이어 일으킨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가 욕계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욕계의 산란한 상태가 된다.
한편 욕계에서 일으키는 희망도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꽃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희망이 성취된 상태는 앞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현실에서 꽃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꽃이라고 가리키게 되는 부분[상相]이 따로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부분[상相]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추구해간다.
그래서 희망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
이 경우는 희망에 해당하는 일정한 관념[상想 Saṃjña]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에 상응한 상(相 Lakṣaṇa)을 찾는 상태다.
예를 들어 꽃을 구하려 한다.
그러면 그는 거리에서 계속 초점을 맞추어 옮긴다.
그런 가운데 꽃에 해당한 부분[상相]을 찾아대는 상황이 된다.
그런 가운데 쉼 없이 초점을 옮겨 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업을 행해나간다.
그래서 이 역시 욕계의 산란한 상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욕계에서 초점 밖 영역
현실에서 일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한다.
그런 경우 망상분별에 바탕해 상을 취한다.
그런데 이 경우 초점 밖 부분을 생각해보자.
이들 부분도 <감각현실>이다.
따라서 광의의 색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정한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분별도 따로 일으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 내용을 얻는다.
이 때 앞부분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본다.
그 경우 '그 부분이 꽃이다'라는 식으로 분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내어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대단히 넓은 내용을 함께 본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는 별다른 분별을 따로 일으키지 않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다음 실험을 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갑자기 오른쪽 끝 부분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 순간에서 그가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미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 경우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곧바로 답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다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후 그 부분에 대해 분별을 일으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 끝 부분은 바위이다'라고 다시 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왼쪽 끝이 무언가를 묻는다.
그러면 역시 앞과 마찬가지가 된다.
한편 현실에서 눈을 뜨고 멍한 상태로 임한다.
이런 경우 그 전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임한다.
눈을 처음 뜰 때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이다.
즉 하나의 <감각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경우 이는 본래 얻는 <감각현실> 그대로다.
즉 이에 대해 일일이 분별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는 그냥 <감각현실> 그대로 상태다.
그래서 결국 처음 색ㆍ수ㆍ상ㆍ행ㆍ식 가운데 색 자체다.
그래서 이 상태는 색계 상태에 준한다.
♥Table of Contents
▣- 욕계의 심일경성 단계
처음 현실에서 여러 부분에 산란하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산란하게 상을 일으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집중한다.
이런 경우 초점을 맞춘 부분에만 관념을 일으킨다.
한편, 이런 경우 집중으로 나머지 영역에 대한 분별도 제거된다.
이런 경우, 초점을 맞추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집중을 통해 이런 부분은 아무런 분별을 대응시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얻는 색 그대로 남게 된다.
한편 집중을 통해 분별 영역에서 다른 잡념 등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오직 초점을 맞춘 부분만 상(相 Lakṣaṇa)을 취한 상태다.
이 경우 처음 그 부분을 대해 일정한 관념분별[상想 Saṃjña]을 일으킨다.
이 경우 그런 생각[想]을 바탕으로 그런 일정부분에 상[相]을 취한다.
그래서 이 경우 이 부분만 욕계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망상분별의 상태다.
이 사정은 이미 앞에서 살폈다.
따라서 욕계의 심일경성은 이런 망상분별에 바탕한다.
♥Table of Contents
▣- 색계 삼매
욕계에서의 심일경성 상태를 이룬다.
그런 경우 그 부분만 욕계 상태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부분을 대해 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집중한다.
그런 가운데 초점을 맞춘 부분만 분별이 대응한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일정한 주제로 상을 떠올려 관한다.
예를 들어 부처님 광명에 대한 상을 떠올려 관한다. [관상]
그런 경우 초점을 맞춘 그 부분에서 그런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념영역에서 그런 빛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처음 일으킨 관념분별[상想 Saṃjña]을 대체시킨다.
그러면 욕계의 기본 상태에서 벗어난다.
이 경우 그는 <감각현실>과 관념도 얻고 있다.
즉 상을 관해 떠올리는 관념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과 사의 작용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욕계 상태와 다르다.
즉, 일정한 생각[想]을 바탕으로 일정부분에 상[相]을 취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처음 현실에서 상을 취해 망상분별을 일으켜 임하는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욕계 상태애서 벗어난다.
그리고 색계의 삼매 상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무색계 삼매
처음 현실에서 일정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집중한다.
그런 가운데 색계 삼매 상태가 된다.
삼매를 닦는 한 일정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자세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즉, 처음에 <감각현실> 영역에서 일정 부분에 상(相 Lakṣaṇa)을 취해 집중했다.
그리고 이런 집중상태는 계속 유지한다.
이는 산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일정 주제로 상을 관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속의 상[想 Saṃjña]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과 사의 작용을 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일정한 생각[想]을 바탕으로 일정부분에 상[相]을 취하는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욕계 상태와 다르다.
그리고 이후 계속 삼매의 단계를 밟아나간다.
그래서 점차 심과 사를 제거해간다.
그래서 이후 단계별로 우수(憂受)ㆍ희수(喜受)ㆍ고수(苦受)ㆍ낙수(樂受)가 끊어진다.
그리고 단지 비고락수(非苦樂受)만 남는다.
그런 가운데 다시 무색계 삼매 상태에 들어간다.
처음 공무변처정에 들어간다.
여기서 먼저 색과 허공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보자.
여기서 색은 보거나 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허공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하늘을 본다.
일정 부분에는 구름이 보인다.
또 산이 보인다.
그래서 각 부분을 가리키며 그 부분이 무언가를 묻는다.
그러면 그 부분바다 일정하게 분별을 일으켜 답하게 된다.
즉 저 부분은 구름이다.
또 이 부분은 산이다.
이렇게 답하게 된다.
그런데 중간의 허공 부분을 가리킨다.
그 경우는 별다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답하기 곤란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감각현실> 영역에 별다른 분별을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허공이라고 칭한다.
이 경우 굳이 그 부분을 분별하려 한다.
이 경우 다른 사물을 의존해 간접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어떤 사물을 넣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사물이 들어갈 수 있는 빈 영역이라고만 분별하게 된다.
이것이 곧 허공이나 공간 관념이다.
그런데 처음 <감각현실>을 얻었다.
이 경우 초점을 맞추고 대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에 따라 분별을 대응시켜 일으킨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 각 경우 성격이 다르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자.
이 경우는 처음 <감각현실> 그대로다.
그리고 그에 대응한 분별을 따로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는 실질적으로 허공에 준한다.
물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분별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일정한 분별을 행할 수 있다.
단지 그 부분이 허공인 경우는 별다른 분별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분별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결국 허공이어서 분별하지 못한 경우와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실질적 차별이 없게 된다.
무색계 삼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처음 무색계 삼매에 들기 위해 허공에 대하여 승해(勝解)를 일으킨다.
그리고 색과 장애의 갖가지 상[유색유대有色有對]을 마음에서 제거한다.
그 때문에 갖가지 그런 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종종상부작의種種想不作意]( 『유가사지론』 제33권)
그래서 <감각현실>에 대해 일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오로지 수ㆍ상ㆍ행ㆍ식 영역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후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진다.
이 경우 <감각현실>에서 일체 취하는 부분이 남지 않게 된다.
즉 <감각현실>에서 취하는 상(相 Lakṣaṇa)이 일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 단계와는 성격이 다시 달라진다.
그래서 이후 단계는 무색계 삼매 단계가 된다.
욕계 상태와 이들 각 삼매 단계의 특성 차이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평소에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이 경우 초점이 산만하다.
그래서 산만하게 각 부분에 대응해 대강의 분별을 따라 일으킨다.
예를 들어 평소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뚜렷이 맞추지 않고 임한다.
그런 가운데 길을 걸어간다.
그런 경우에도 산만한 가운데 각 부분에 일정한 분별을 대강 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는 대강 건물과 길이 놓여 있다고 의식한다.
그리고 이처럼 산만하게 대강 분별을 행하고 임한다.
이 경우 그 <감각현실> 부분이 허공에 해당한 부분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만 별다른 분별이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 [욕계 산란상태]
그런데 이후 한 부분에 초점을 집중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별은 상대적으로 점차 사라져간다.
그리고 점차 그에 집중을 강하게 한다.
그럴수록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산만한 분별은 온전히 사라진다. [욕계 심일경성]
한편, 초점을 맞춰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처음 이에 대한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처럼 상을 취해 일으킨 '분별[想 Saṃjña]은 대체해 제거한다.
그러면 '<감각현실>에 대응한 분별'은 행해지지 않는다.
다만 <감각현실> 부분에 상(相 Lakṣaṇa)을 취해 집중을 유지하는 상태가 된다.
이를 통해 색계 삼매상태가 된다. [색계 삼매]
이후 집중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가운데 <감각현실>에 상(相 Lakṣaṇa)을 취해 집중하는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감각현실> 영역은 그 전체가 모두 허공에 준하는 상태가 된다.
물론 <감각현실> 영역에는 여전히 내용이 맺혀 들어온다.
만약 이 경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분별을 한다.
그러면 구름이나 산이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만 본래 허공인 부분만 딱히 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감각현실>이 여전히 그렇게 들어오는 상태다.
일반 상태나 색계ㆍ무색계 삼매시 <감각현실>을 얻는 자체는 다르지 않다.
즉 삼매 수행은 감각기관 자체를 제거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감각기관에 독을 발라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다.
또 일부로 감각기능을 중단시키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삼매 수행시 눈을 감거나 귀를 막고 닦는 것이 아니다.
눈도 있다.
그리고 눈도 뜬다.
그래서 <감각현실>도 얻는다.
그래서 <감각현실> 자체는 시종일관 계속 얻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 욕계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다만 집중을 행해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이를 통해 처음 의식 상태와 성격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처럼 <감각현실> 일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대응한 분별이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 <감각현실>은 단지 막연한 <감각현실>로만 남는다.
그래서 이들 전체는 허공과 실질적으로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후 집중은 색을 떠나 수ㆍ상ㆍ행ㆍ식 부분으로 옮겨 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는 무색계 삼매 단계가 된다. [무색계 삼매]
♥Table of Contents
▣- 색계 무색계와 궁극적 수행목표
일반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러면 일정한 분별을 따라 일으킨다.
이 경우 일정한 분별[想]을 바탕으로 <감각현실> 일정부분에 상[相]을 취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분별은 대부분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신견ㆍ변견ㆍ사견ㆍ견취견ㆍ계금취견 5이사(利使)]
그리고 이에 바탕해 일으키는 탐ㆍ진ㆍ치ㆍ만ㆍ의 정서적 의지적 번뇌도 마찬가지다.[탐(貪)ㆍ진(瞋)ㆍ치(癡)ㆍ만(慢)ㆍ의(疑) 5둔사]
물론 망집을 일으킨 상태에서는 이를 거꾸로 생각한다.
이들을 곧 실다운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별을 옳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런 분별을 행함을 지혜롭다고 잘못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리고 업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고통을 받아나가게 된다.
그런데 삼매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일정 내용에 마음을 집중한다.
그러면 초점을 맞춰 집중한 내용만 남는다.
그리고 초점 밖 나머지 내용은 의식에서 사라진다. [사마타]
이를 통해 대부분 산란한 망상분별과 번뇌가 제거된다.
처음 색계 초선단계는 심(尋-거친 생각)ㆍ사(伺-세밀한 생각)ㆍ희(喜 기쁨)ㆍ낙(樂 즐거움)ㆍ삼매[등지等持] 요소를 갖는다.
그리고 이후 말ㆍ색상(色想)ㆍ심(尋)ㆍ사(伺)ㆍ희(喜)ㆍ낙(樂) 등의 번뇌를 끊어 나간다.
그리고 이런 분별과 번뇌를 일으키는 기본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악업으로부터도 떠나게 된다. [정려율의]
또한 이를 통해 지혜도 청정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끝내 멸수상정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가 의식에서 제거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들이 현실에서 잘못된 망상분별과 번뇌를 일으키는 재료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제거된 상태가 된다.
현실에서 의식 표면 내용만을 문제로 본다고 하자.
그래서 이 측면만 본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번뇌가 모두 다 제거된 듯하다.
그런 경우 이들 표면 내용만 제거해 생사묶임에서 벗어난다고 여기기 쉽다.
그런데 그렇게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삼매 외에 이를 제거할 다른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감관 및 인식기관에 독을 발라, 기능을 정지시킨다.
또는 감관이나 인식기관을 아예 제거한다.
심지어 아예 죽음을 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식표면 내용도 제거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생사묶임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의 표면상 망집 번뇌는 일정한 근본정신 구조와 기제에 바탕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이런 망집 번뇌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이들 방안으로 그 배경 사정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즉 이런 방안으로 제8식 제7식의 근본 구조와 기제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과거에 쌓은 업장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이는 다음 생도 마찬가지다.
한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는 번뇌가 있다. [구생기 신견과 변견, 탐ㆍ진ㆍ만ㆍ의 등]
이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생사현실에서 위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생사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삼매 수행으로 의식표면의 내용을 제거한다.
그렇다고 이런 근본정신과 구조 자체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삼매에 든 상태에서 다시 이를 벗어난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는 궁극적 구경열반(究竟涅槃)은 아니다. [차별열반(差別涅槃)] <유가사지론 제52권>
따라서 삼매로 얻는 이런 상태는 궁극적 해탈 열반 상태로 볼 수 없다.
결국 이는 생사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안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삼매 수행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다.
삼매는 일단 많은 망집번뇌를 제거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혜 보리 자량을 얻게 한다.
따라서 삼매는 수행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삼매만으로 완전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닐 뿐이다.
♥Table of Contents
▣- 생득정과 해탈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번뇌와 악행을 멈추게 된다.
또 몸가짐 등이 저절로 율의에 들어맞게 된다.
그래서 계체(戒體)를 얻는다. [정려율의靜慮律儀]
이는 장차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생득정生得定]
그래서 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에 태어난다.
이런 경우 자연히 삼매 상태로 임하게 된다.
이를 생득정(生得定)이라 표현한다.
색계는 <생 정려>(生靜慮)라 표현한다.
무색계는 <생 무색>(生無色)으로 표현한다.
한편, 색계와 무색계에는 3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한 하늘만 존재한다.
따라서 일단 욕계 3악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욕계 하늘보다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예를 들어 욕계 하늘 가운데 4대천왕을 살펴보자.
이 경우 인간 50세(歲)가 4대천왕중(大天王衆)의 1일 낮밤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낮밤 30일을 1달로 하고 12달을 1세(歲)로 한다.
그런 가운데 4대천왕중(大天王衆) 수명은 500세다.
한편, 도리천은 다음과 같다.
인간 100세(歲)가 33천(天)의 1일 낮밤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낮밤 30일을 1달로 하고 12달을 1세(歲)로 한다.
그리고 그 천(天)들의 수명은 천세이다.
그리고 위 단계 하늘로 갈수록 이들 내용이 각기 2 배씩 증가한다.
인간계 햇수로 환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각 하늘의 일반적인 수명은 다음과 같다.
4천왕천 하루 (인간계의 50년) * 360 * 수명 500세 = 9,000,000 년
도리천 하루 (인간계의 100년) * 360 * 수명 1000세 = 36,000,000 년
야마천 하루 (인간계의 200년) * 360 * 수명 2000세 = 144,000,000 년
도솔천 하루 (인간계의 400년) * 360 * 수명 4000세 = 576,000,000 년
화락천 하루 (인간계의 800년) * 360 * 수명 8000세 = 2,304,000,000 년
타화자재천 하루 (인간계의 1600년) * 360 * 수명 16000세 = 9,216,000,000 년
한편 각 색계 천들의 수명은 겁으로 헤아릴 만큼 길다.
한편 무색계천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길다.
공무변처(空無邊處)의 수명은 2만겁(萬劫)이다.
식무변처(識無邊處)의 수명은 4만겁(萬劫)이다.
무소유처(無所有處)의 수명은 6만겁(萬劫)이다.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수명은 8만겁(萬劫)이다.
( 『유가사지론』 제4권 )
이처럼 각 하늘의 수명이 길다.
3악도 생사고통을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경우 자칫 색계와 무색계 하늘을 그 해결 방안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 역시 인천교 문제점을 갖는다.
이는 처음 10선법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수행과 성격이 같다. [인천교]
욕계나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난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는 생사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다.
색계 무색계 천의 수명이 대단히 길다.
예를 들어 비상비비상처의 8만겁은 대단히 긴 기간이다.
그런데 이 8만겁을 다시 9번 나열한 기간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를 다시 8만겁과 비교한다.
그런 경우 무시무종 시간대에서 8만겁은 역시 찰나 쪽에 오히려 가깝다.
그리고 이런 수명이 끝난다.
그러면 다시 3계 6도에서 생사고통의 윤회를 밟아나간다.
따라서 이는 완전히 생사 묶임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다.
이는 그 기간이 비록 길어도 임시방편에 그친다.
그래서 이를 궁극적 목표 상태로 삼기 곤란하다.
♥Table of Contents
▣- 중생 제도와 욕계를 택하는 사정
삼매는 현실에서 색계ㆍ무색계 삼매를 닦을 수 있다. [수득정修得定]
한편 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에 태어난다.
이런 경우 자연히 삼매 상태로 임하게 된다. [생득정生得定]
이런 경우 일단은 임시적으로 욕계 생사고통에서 벗어난다.
또한 이런 삼매를 통해 번뇌도 임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 구경열반(究竟涅槃)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삼매 수행을 바탕으로 이후 지혜를 원만히 닦아 나가야 한다.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 보리 자량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본 번뇌와 무명을 제거한다. [신견ㆍ변견ㆍ사견ㆍ견취견ㆍ계금취견ㆍ탐(貪)ㆍ진(瞋)ㆍ치(癡)ㆍ만(慢)ㆍ의(疑)]
그런 경우 수행의 깊이에 따라, 각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를 예류과ㆍ일래과ㆍ불환과ㆍ아라한과 등으로 구분한다.
현생에서 이들 번뇌를 다 제거해 아라한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욕계와 색계ㆍ무색계 하늘을 오가는 가운데 구경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색계 무색계는 수행과정에서 태어나는 곳이 된다.
그러나 정작 수행의 궁극적 목표지는 아니다.
그런데 한편, 중생제도를 목표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살승]
이런 경우 삼매를 닦아 색계ㆍ무색계에 태어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색계 무색계는 전체가 하늘로만 구성된다.
그리고 그 수명이 겁을 단위로 헤아릴 만큼 길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사고통 문제를 강 건너 불로 대하게 된다.
그만큼 색계ㆍ무색계 중생은 생사 문제에 여유를 갖는다.
그래서 정작 수행에 관심을 갖지 않기 쉽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중생제도를 하려 한다고 하자.
이는 당장 병자가 없는 곳에 병원을 개업하는 것과 비슷하다.
수행자가 중생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로 수행을 한다.
그런데 그 수행자가 삼매 수행을 통해 충분히 색계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상태다.
그런 경우 이를 증득해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욕계에서 중생들이 고통 받는다.
따라서 이런 상태의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방편을 취해 욕계로 태어나는 것을 권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삼매를 닦을 때 4무량심을 주제로 삼매를 닦아야 한다.
이는 잠에 들기 전 다음날 할 일과 일어날 시각을 생각하며 잠드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 삼매를 닦는 순서는 색계4선ㆍ4무량심ㆍ무색계4선의 단계로 닦게 된다.
▼▼▼-------------------------------------------
이하는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169 ~183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8장_2유식_2_5위백법.txt
cf 부파불교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 169 ~183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Table of Contents
▣- 지혜를 통한 근본적 번뇌 제거
생사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런 경우 망집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런데 이는 중독환자가 중독 증세를 끊어내는 일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도박, 흡연, 음주, 마약중독에 빠져 있다.
이런 경우 먼저 그가 이런 일이 길게 보아 좋지 않음을 모를 수 있다.
즉 그런 행위가 좋은 일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먼저 그것이 넓고 길고 깊게 보아 좋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한편 그것이 좋지 않음을 잘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중독자의 경우 그 행위를 쉽게 끊지 못한다.
이성적으로는 좋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행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한다.
즉 생각과 마음과 몸 행위가 각기 따로따로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우선 그런 중독행위가 잘못이고 좋지 않음을 확고하게 뚜렷이 인식한다.
이후 이에 바탕해 그 행위를 단호하게 뚝 끊는다.
그리고 이후 겪는 금단현상이나 불만ㆍ고통을 평안히 잘 참고 견딘다.
그리고 올바른 희망을 일으켜 그에 전념해 나간다.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처음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런 바탕에서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반복해 받아 간다.
이런 상태에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런데 이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망집 번뇌는 발생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일으킨다.
우선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경우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구생기 신견, 아견ㆍ아애ㆍ아취ㆍ아만]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유ㆍ무, 상ㆍ단의 분별을 통해 변견을 일으킨다. [구생기 변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탐ㆍ만ㆍ진ㆍ치의 정서적 의지적 번뇌를 일으킨다. [탐ㆍ만ㆍ진ㆍ치]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생을 출발한다.
그런 경우 이런 사정으로 분별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먼저 자신과 세상의 정체에 잘못된 분별을 행한다. [분별기 신견, 변견]
그리고 인과 및 수행목표와 성취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일으킨다. [사견ㆍ견취견ㆍ계금취견]
그런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의]
또 이런 근본번뇌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번뇌를 일으킨다. [20수번뇌]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런 망집 번뇌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고통의 생사현실에 묶인다.
따라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원인 망집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신견 하나를 제거해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현실에서 일정 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평소 이에 대해 대단히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그가 삶에서 일으키는 모든 집착은 이에 바탕한다.
이런 경우 먼저 그런 부분이 참된 진짜로서의 자신이 아님을 뚜렷이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 여러 망상분별도 마찬가지다. [미리혹]
그래서 이런 망상 집착이 생사고통을 얻게 한다.
이런 사정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하자.
즉, 어떤 부분이 참된 자신의 몸이 아님을 잘 이해한다.
그래도 평소 자신의 신체 부분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신체로 여기는 부분에 상처가 난다.
그러면 우선 감각적으로 심한 통증의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쾌와 고통을 느끼게 된다. [미사혹]
그리고 분노나 슬픔을 일으키게 된다.
즉,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상대나 상황에 대해 미움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무언가를 부수거나 해치는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기 쉽다.
그리고 업을 행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들 부분은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과 성격이 다르다.
그가 이론상 그런 정서적 의지적 반응이 안 좋음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평안히 참고 견디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적 이해만으로 감각이나 정서적 태도나 의지를 바로 끊기 힘들다.
그래서 이는 수행을 반복해 끊어내게 된다.
번뇌를 끊어내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위와 같은 단계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잘 밟아 끊어야 한다.
번뇌와 생사고통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즉, 망집 번뇌 → 업 → 생사고통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를 닦아 업부터 중단함에 치중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번뇌를 다시 제거해 간다.
이 경우도 업과 관련이 깊은 번뇌부터 집중해 제거한다.
한편 번뇌는 당장 제거가 쉬운 것부터 제거한다.
제거가 어려운 것부터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수혹]
그러면 일단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도 그 제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번뇌도 함께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러나 쉬운 것부터 제거한다. [견혹]
그러면 그 제거가 일단 쉽다.
그래서 이런 번뇌부터 하나씩 제거한다.
그러면 이를 통해 처음에 제거가 어려웠던 번뇌들도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방안을 취한다.
망집 번뇌는 발생적으로는 위에 나열한 순서가 된다.
그러나 이런 망집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제거가 쉬운 표면상 번뇌부터 하나씩 제거한다.
우선 수행 예비단계에서 3현(賢)ㆍ4선근(善根)을 닦는다. [자량위ㆍ가행위]
세제일위는 이 단계의 최후 단계다.
이런 세제일위(世第一位) 직후 번뇌를 낳지 않는[무루無漏] 지혜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후 다음 번뇌들부터 제거한다.
이는 분별기에 이치에 미혹해 일으킨 번뇌들이다.
신견(身見)ㆍ변견(邊見)ㆍ사견(邪見)ㆍ견취견(見取見)ㆍ계금취견(戒禁取見)의 5리사(五利使),
탐(貪)ㆍ진(瞋)ㆍ치(癡)ㆍ만(慢)ㆍ의(疑)의 5둔사(五鈍使)가 이에 해당한다.
올바로 이치를 관해 이런 번뇌를 제거한다.
그런 경우 이런 노력만으로 제거하기 힘든 번뇌가 남는다.
즉, 정서적 의지적으로 뿌리 깊은 번뇌들이 남게 된다.
이런 경우 이들은 꾸준한 수행노력을 통해 끊어 나간다.
이들이 수행을 닦아 끊어야 할 번뇌가 된다.
구사종에서는 탐(貪)ㆍ진(瞋)ㆍ치(癡)ㆍ만(慢)을 이런 번뇌로 나열한다.
대승유식종에서는 구생기 신견ㆍ구생기 변견을 이에 추가한다.
결국 이들 탐ㆍ진ㆍ치ㆍ만과 구생기 신견ㆍ구생기 변견은 이런 수행노력으로 끊어가야 한다.
한편 각 수행단계별로 끊게 되는 번뇌를 나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행단계를 나눈다.
이들 내용은 번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는 뒤에서 따로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수행과정에서 어떤 단계 어떤 상황에서든 이들 번뇌를 끊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위 10 가지 근본번뇌를 중심으로 이를 끊을 방안을 대략적으로 살핀다.
이를 우선 끊기 쉬운 번뇌부터 순서대로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의심의 제거
세상과 자신의 정체에 대해 먼저 올바로 옳게 판단한다.
그리고 현실이 나타나는 인과에 대해서도 옳은 판단을 한다.
한편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상태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올바로 판단한다.
그래서 올바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이를 성취할 올바른 방안을 찾는다.
그래야 그에 따라 올바른 방안을 통해 올바른 목표 상태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 전반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스승을 만난다.
그런 가운데 지식을 습득한다.
그런 경우 이런 위험이 증가된다.
그런 가운데 엉뚱한 내용을 현실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추구한다.
따라서 생사고통에 묶인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결국 위에 나열한 내용에 대해 올바르고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들 내용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제시하는 4제법이나, 연기법 내용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이 경험하고 확인 가능한 내용이 있다.
이는 주의 깊게 반복해 관찰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되는 내용의 전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살핀다.
그리고 같고 다름을 분별한다.
그런 현실 경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그런데 내용에 따라 현실에서 쉽게 진위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 내용을 당장 경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공간상 멀리 떨어진 영역에 대한 판단도 그와 같다.
또는 시간상 과거 미래로 떨어진 영역도 그와 같다.
또는 감관이나 인식기관과 관련된 장애로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
한편 3계 6도에서 하늘이나 지옥 등 다른 세계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각 주체가 직접 그런 상태에 놓인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그 주체는 결국 직접 알지 못하게 된다.
또 현생의 업과 사후 상태의 관계도 사정이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업을 행한다.
그러면 사후에 하늘에 가게 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 양쪽 상태를 함께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한편 본래 한 주체가 끝내 얻을 수 없는 영역의 내용도 있다.
본바탕 실상의 정체를 확인하는 문제가 그런 경우다.
이런 경우 이 내용을 아는 이의 가르침을 대한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직접 경험만을 의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내용에 바탕해 수행을 닦지 못하게 된다.
또 이로 인해 그 과보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함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먼 곳을 가는 경우와 같다.
이런 경우 먼저 직접 그 장소를 본 후 출발하겠다고 고집한다.
그러면 끝내 그런 장소는 갈 도리가 없다.
가봐야만 그 장소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그 장소를 가서 보았다.
그런 경우는 그는 그 사정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이에게 그 사정을 말로만 알려준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는 또 처음 상태와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수행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행의 결과를 얻으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스승과 법을 믿고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실천 수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음 어떤 스승과 어떤 내용을 먼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
잘못된 스승과 내용에 대해 맹신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경우는 보조적으로 다음 방안을 택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 귀납추론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는 다음 방식이다.
어떤 이가 경험 가능한 내용과 그렇지 않는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이 가운데 자신이 경험하고 확인 가능한 내용을 검토한다.
그런 가운데 거짓이 많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머지도 역시 거짓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거짓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머지도 역시 거짓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개연성일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들 내용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을 갖는 상태로 남게 된다.
그래도 막연히 의문을 갖는 상태와는 달라진다.
한편 두 번째는 거짓을 제공할 가능성과 경우를 검토해본다.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많은가를 헤아려본다.
이런 방식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
현실에서 어떤 이가 거짓을 말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로 다음을 나열할 수 있다.
우선 그 자신부터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내용을 확신하며 진술한다.
그래서 내용이 잘못인 경우도 있다.
한편, 그 자신부터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사유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장난삼아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또는 단순히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없는 일을 꾸며 말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일부로 거짓을 말할 경우도 있다.
상대를 속여 이익이나 지위 등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또는 좋은 취지에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임시방편으로 상대를 속여 좋은 상태로 이끌려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로 다앙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진위를 판정하려고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어떤 기자가 외국을 다녀와 경험한 내용을 보고한다.
이 경우 자신은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런 여러 경우와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그래서 과연 거짓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를 검토해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정이 비슷하다.
처음 부처님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이런 여러 방안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단 현실 단면에서 직접 그 진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부터 검토해본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부터 잘못된 판단이 많다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영역도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정이 그렇지 않다.
한편, 거짓을 말할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한다.
이런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능성이 적음을 판단할 수 있다.
현실에서 부처님이 직접 이익이나 지위를 탐하지 않는다.
또 수행자에게도 역시 그런 상태를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세속의 이익이나 지위에 대한 탐심을 제거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사적으로 이익을 구하는 가능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세속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와 거리가 멀다.
♥Table of Contents
▣- 계금취견의 제거
현실에서 성취해야 할 올바른 목표가 있다.
그런데 목표를 올바로 찾지 못한다.
또 올바른 목표를 찾아도 성취할 올바른 방안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엉뚱한 목표를 엉뚱한 방안으로 성취하려 임하는 경우가 많다.
수행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계율이나 일정한 금지사항 등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된다.
이를 계금취견[戒禁取見 śīla-vrata-parāmarśa]이라 칭한다.
예를 들어 못에 올라 앉아 고행을 한다.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다고 잘못 여기는 경우와 같다.
이런 계금취견을 갖는다.
그런 경우 올바로 계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함부로 행해 나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잘못된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히려 생사고통을 더 장구하게 겪어나가게 된다.
따라서 수행을 올바로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계금취견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수행목표와 성취방안의 관계는 결국 인과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제시하는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다.
즉, 4제법이나, 연기법 내용들을 통해 이를 제거한다.
다만 이 경우 의심[疑]의 항목에서 살핀 문제가 제기된다.
수행목표와 방안은 생사에 걸친 인과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원인이나 결과를 이번 생에 경험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어떤 행을 과거에 닦았기에 지금 축생으로 태어나 사는가가 문제된다.
또는 지금 어떤 행을 닦아야 죽어서 3악도를 벗어나는가가 문제된다.
또 어떤 행을 닦아야 죽음 이후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또 어떤 행을 닦아야 죽음 이후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이들은 모두 전생ㆍ현생ㆍ후생에 걸친 인과 문제다.
그래서 현생 안에서 이들 관계를 경험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삿된 스승이나 가르침이 제시돼도 직접 진위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런 가운데 삿된 스승이나 가르침을 맹신하게 된다.
그러면 곧 잘못된 계금취견을 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잘 선택해 믿어야 한다.
다만 각 주체는 여러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옳고 올바른지를 직접 확인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 결국 의심(疑)의 제거 항목에서 살핀 방안에 의존해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는 중복을 피해 생략한다.
♥Table of Contents
▣- 신견의 제거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손으로 가리켜보자.
그리고 또 자신의 몸 아닌 부분을 손으로 가리켜보자.
현실에서 이처럼 대부분 탁자나 꽃 바위와 자신의 몸을 구분한다.
결국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다.
현실에서 이처럼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이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잘못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을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망상분별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집착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인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잘못된 신견을 제거해야 한다.
현실에서 일정한 부분을 자신으로 여겼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이런 판단이 잘못인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 그렇게 자신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본 정체는 무엇인가를 함께 잘 파악해야 한다.
한편,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님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 경우 다시 다음 문제를 추가로 살펴야 한다.
현실에서 자신으로 여긴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 자신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고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망상분별을 일으키게 하는 배경사정을 다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자신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자.
그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잘못 이해했던 내용이 있다.
이 경우 이제 그런 내용에 해당할 부분은 대신 무엇인가를 또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후 그런 바탕에서 현실에서 다시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이 상황을 비유로 들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어리석은 이가 벽돌을 자신으로 잘못 여겼다.
이 경우 이것이 잘못임을 이해하려 한다.
그 경우 자신으로 여기고 대한 벽돌 부분이 있다.
이 경우 먼저 그 벽돌은 그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그래서 그런 벽돌 부분이 자신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이 경우 그 벽돌을 처음 자신으로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자신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런 경우 자신은 이제 그 벽돌 대신 어떤 부분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다음 문제가 있다.
이제 벽돌이 자신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그가 벽돌을 자꾸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에는 일정한 배경 사정이 있다.
그래서 그 사정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정들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주어지는가를 다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벽돌이 자신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경우 현실에서는 이후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다시 잘 살펴야 한다.
현실에서 갖는 신견의 문제도 이와 사정이 같다.
신견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우선 자신의 정체에 대해 올바로 관해야 한다.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우선 이들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모두 그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즉 평소 자신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본 정체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따라서 그런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을 얻는 '자신'>이나 <외부세상>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즉 자신이 눈을 통해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자신의 눈을 통해 마음에서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이런 마음 내용에 그 내용을 얻게 한 자신이 들어가 있을 이치는 없다.
그래서 평소 눈을 떠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참된 자신이 아니다.
이처럼 이들 내용이 자신이 얻어낸 내용임을 이해한다.
그래도 여전히 일정 부분은 현실에서 자신으로 여긴다.
이런 경우 다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즉,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마음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이 그처럼 파악되는 데에는 사정이 있다.
즉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로서의 자신이 뼈대로 있기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잘못 여긴다.
이런 경우 이에 바탕해 그런 내용을 실답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에 집착을 갖고 임하게 된다.
그러나 우선 참된 진짜로서 영원하고 고정된 뼈대로서 실체는 없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현상도 일어날 도리가 없다.
또 그런 것이 설령 있다고 하자.
그런데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내용은 변화한다.
따라서 무상하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자신은 이런 실체와 관련 맺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살필 실익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먼저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아, 무자성]
한편, 다시 다음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즉, 마음 밖 본바탕에 그런 자신의 실재가 그처럼 있다.
그렇기에 현실에서 그런 내용을 얻게 된다고 여긴다.
이런 경우에도 이에 망상분별에 바탕해 그런 내용을 실답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에 집착을 갖고 임하게 된다.
그러나 한 주체는 자신의 마음이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는다.
자신이 현실에서 얻는 내용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본바탕 실재는 자신의 마음과 관계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래서 한 주체는 그런 실재를 끝내 얻어낼 도리가 없다.
그래서 실재는 공하다. [공삼매]
그리고 본바탕에서는 그런 부분을 역시 얻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 내용은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같다.
따라서 꿈처럼 실답지 않다.
현실 내용은 본바탕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 내용이 본바탕 실재에 그처럼 있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신견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실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에 집착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한편, 현실에서 얻는 내용들의 관계도 이와 사정이 같다.
우선 일정 부분을 대해 그 부분이 자신이라고 분별을 일으킨다.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손으로 가리켜본다.
이 때 자신이 일정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그런 부분이 곧 그런 분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경우 그런 내용이 실답게 그런 부분에 그처럼 '있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답게 여긴다.
그리고 집착을 갖는다.
이처럼 일정한 관념분별에 바탕해 현실에서 상(相)을 취해 가리킨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감각현실>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해 평소 일으키는 생각 분별은 관념 내용이다.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또한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무상삼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상과 아집을 기본적으로 제거한다.
한편, 4제법을 통해 다음의 관계도 함께 잘 관한다.
일정 부분을 잘못 자신으로 취한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업을 행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망집번뇌와 생사고통의 인과를 이해한다.
그래서 4제법과 연기법 등을 올바로 관한다.
한편 그런 현실 일체는 무상ㆍ고ㆍ무아ㆍ공이다.
이런 사정을 함께 잘 이해한다. [고제ㆍ고집제]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참된 자신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고 임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그런 잘못된 망상분별을 일으키게 되는가를 다시 살펴야 한다.
현실에서 일정한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이렇게 되는데에는 일정한 배경사정이 있다.
우선 이런 부분은 늘 그런 상태로 유지된다고 여긴다. [상일]
거리를 걷는다.
그러면 배경부분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시 들고 나는 손님과 같다고 여긴다. [객진]
그러나 평소 자신으로 여긴 부분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과 달리 주인의 위치에 있는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
또 평소 이런 부분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다.
즉 자신이 어디론가 움직이려는 뜻을 갖고 움직인다.
그 경우 평소 자신으로 여긴 부분만 따라 움직인다.
이런 경험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기에 이런 부분이 자신의 뜻처럼 즐거움을 준다고 여긴다. [주재]
한편, 그런 몸 부분을 다른 바위나 꽃에 댄다.
그러면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에서 일정한 촉감을 느낀다.
한편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손을 댄다.
이 경우 양쪽 부분에서 모두 촉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과 다른 부분은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몸 부분은 주관이 위치하는 부분으로 여긴다. [대상에 대한 주관]
그런데 자세히 이를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파악하게 된다.
우선 그런 부분이 늘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가 부터 살펴보자.
갓난아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인 내용이나 육체적 내용을 살핀다.
그런데 어느 한 요소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없다.
이는 숨을 쉬고 내쉬는 찰나 간에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무상]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선 자신의 몸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머리카락을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다.
한편, 자신의 몸에는 자신과 별개로 생활하는 다른 생명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내장에는 많은 세균이 있다.
자신의 몸에서 이처럼 미생물을 포함한 다른 생명을 모두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이 상황을 버스 운전사의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버스와 버스에 탄 승객이 모두 다 운전사 뜻대로 이동해간다.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이들을 모두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버스에 탄 승객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 지점이 되면 그 버스에서 내리게 된다.
평소 자신의 몸으로 대하는 부분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자신의 몸에는 작은 세균이나 기생충도 있다 .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는 별개로 따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신의 몸 부분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 자재하게 되는 부분이 본래 아니다.
한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도 자신의 뜻대로 자재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은 생로병사과정을 겪는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생로병사 과정을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겪는 것도 아니다. [고]
한편, 평소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자신의 감관이나 정신 주관이 위치한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자신의 주관이나 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더욱이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을 이치도 없다.
그래서 이들 판단은 모두 잘못이다.
더욱이 이들 부분은 자신이 집착을 가질 만큼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도 관해야 한다. [부정]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ㆍ락ㆍ아ㆍ정의 상태가 아니다.
결국 4제법을 통해 이런 사정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무상ㆍ고ㆍ무아ㆍ부정]
이런 판단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세히 실파기로 한다.
즉 아래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 문제를 살핀다.
이 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참고 ▣- 현실에서 자기자신으로 보는 내용의 검토)
여하튼 이런 관찰을 잘 행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갖는 아상과 아집을 제거해가야 한다.
현실에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자.
그래도 현실에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과 여러모로 특성이 다르다.
이미 앞에서 이런 사정을 보았다.
그래서 그 배경사정을 다시 살펴야 한다.
즉, 어떤 사정으로 그 부분이 그런 특성을 갖는지 사정을 살펴야 한다.
현실에서 일정 부분을 취한다.
그래서 이를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분별은 사실은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즉, 현실에서 신견을 갖는다.
이런 신견은 분별기 이후에 형성된 신견이다. [분별기신견]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분별을 행한다고 하자.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바삐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일일이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로 바삐 길을 나섰다.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떨어진 채 모임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자신의 분별이 없어도 여전히 그런 일정한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분별기에 갖는 신견은 오히려 후발적이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망상분별은 그 뿌리가 깊다.
태어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망집을 일으킨다.
즉, 근본적으로 근본정신과 제7식을 바탕으로 신견을 일으킨다. [구생기 신견]
그리고 이런 분별기 신견은 그런 망집에 바탕해 일으키게 된다.
즉 분별기 신견은 <구생기 신견>에 바탕해 일으킨다.
현실 표면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취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그 바탕으로 한다.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기호로 ))) 로 표시한다고 하자.
처음 근본정신과 제7식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구생기 신견]
그리고 이후 이에 바탕해 각 기관을 분화 발달시킨다. [3능변]
그리고 이런 ))) 바탕에서 현실에 태어나 임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 의식 표면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 내용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분별기 신견]
그래서 현실 의식표면에서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 그런 망상분별은 사실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 )))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 )))는 현실에서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그리고 분별기 신견은 이에 바탕한다.
어느 정도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 분별기 신견이다.
결국 이는 근본적으로 출생 전에 가진 구생기 신견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들 망집은 구생기 신견에 그 배경원인이 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후 그런 상태로 생을 유지한다.
이런 경우 구생기신견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구생기 신견은 1생에 걸쳐 지속된다.
따라서 삶을 유지하는 한 이는 쉽게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제거가 쉽지 않다.
한편 분별기 신견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후발적으로 얻는다.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후발적인 신견을 방치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한다.
이는 병의 경우와 같다.
어떤 병을 원인으로 통증을 겪는다.
그 경우 통증은 후발적인 증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통증을 방치한다.
그러면 그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일단 그 통증부터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증만 제거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런 통증을 일으킨 원인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신견의 제거도 이와 마찬가지다.
분별기 신견은 구생기신견을 바탕으로 일으킨다.
그런데 분별기 신견을 방치한다.
그러면 이런 망집에 바탕해 계속 잘못된 업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인다.
따라서 일단 분별기 신견부터 먼저 잘 제거한다. [견혹]
즉, 그런 견해가 잘못임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앞에 나열된 내용을 잘 검토해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신견이 잘못임을 확고하게 인식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신이 아님을 잘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서 분별기 신견을 제거한다.
그렇더라도 신견과 관련된 번뇌가 남는다.
즉 이런 신견이 현실에서 곧바로 모두 제거되지 않는다.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다.
즉 그 부분에서 여전히 일정한 감각을 계속 얻게 된다.
또 그에 따른 일정한 감정이나 의지를 일으켜 갖게 된다.
평소 신견에 바탕해 일정한 업을 행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전히 그런 업을 행하게 되기 쉽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의 몸이라고 여긴다.
이는 사실은 잘못된 분별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어떤 이가 바늘을 꼽는다.
그러면 감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이 자신이 아님을 반복해 살핀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그에 따른 일정한 감정이나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바늘을 찌른 상대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해치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업을 행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묶인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바늘을 꼽는 일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 바늘을 꼽으면 통증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몸을 비틀며 움직이기 쉽다.
또 상대가 실수하면 심한 원망을 갖기 쉽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치료가 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 통증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참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통증을 느낀다.
그런 경우 일정한 의지를 갖게 된다.
즉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움직이려는 의지를 갖는다.
그러나 이를 억제한다.
그리고 역시 가만히 평안히 참고 견딘다.
그리고 부동자세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현실에서 신견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다.
평소 잘못된 신견에 바탕해 일정한 업을 행한다.
그런데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실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신의 몸이 아님을 확고히 인식한다.
한편, 그런 업이 초래하는 고통의 인과 결과를 뚜렷이 인식한다.
그런 가운데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꾸준히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행은 단순히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신견이 잘못임을 이치상 이해한다.
그래도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일정한 감각을 얻는다.
또 그에 바탕해 여전히 정서적 의지적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꾸준한 수행 노력이 필요하다.
즉, 그런 감각적인 자극이 있다.
그래도 필요한 수행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 정서적, 의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즉 평소 그런 신견에 바탕해 업을 행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평안하게 참고 임해야 한다.
또 이와 반대로 이를 벗어날 수행방안이 있다.
이를 전념해 실천해야 한다.
결국 이런 수행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감각적, 정서적, 의지적인 부분을 함께 제어해야 한다.
그런 꾸준한 수행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삶을 유지하는 한 구생기 신견은 쉽게 제거할 수 없다.
이는 생사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분별기 신견부터 확고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구생기 신견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자.
그 경우 일정한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기본으로 갖게 된다.
이는 그런 신견을 바탕으로 갖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 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즉 그런 몸을 유지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정한 음식을 섭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탐욕을 갖게 된다.
또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침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에 분노를 바탕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보복하는 행위를 해나게 된다.
생사현실에 처한 주체는 망상분별이 이처럼 뿌리 깊다.
그런 상태에서 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곧바로 이들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런 경우 우선 이치상 잘못된 분별부터 확고하게 제거한다.
그래서 잘못된 분별기신견부터 잘 제거한다. [견혹, 견도]
그리고 4제법을 통해 이런 사정을 올바로 이해한다.
그리고 다시 그런 상태에서 꾸준한 수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견은 그런 과정을 통해 끊어가야 한다. [수혹]
♥Table of Contents
▣- 변견의 제거(상견과 단견의 제거)
변견은 상(常)과 단(斷)의 두 극단[二邊]에 집착하는 견해다. [변집견邊執見, anta-grāha-dṛṣṭi]
상견(常見)은 세간(世間)과 자아(自我)는 사후(死後)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아트만[我, 자아]과 범천 등이 영원불멸[常]한 존재라고 여기는 경우와 같다.
반대로 단견(斷見)은 세간(世間)과 자아(自我)는 사후(死後)에 완전히 소멸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후 자신과 관련되어 이어지는 것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긴다.
이런 입장이 단견이다.
이는 인과의 상속, 업(業)의 상속 또는 생사윤회를 부정한다.
상견을 잘못 취한다.
그러면 이런 망상분별에 바탕해 현실을 대단히 실답게 여긴다.
그리고 집착을 갖고 임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업을 행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한편, 단멸관을 잘못 취한다.
이런 경우 인과 문제를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관한다.
그래서 이런 한 생만 고려한다.
그런 가운데 삶에 임한다.
그리고 삶의 목표도 대단히 잘못 설정한다.
그런 경우 넓고 길고 깊게 관찰하는 입장과 대부분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내용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임한다.
그래서 매순간, 세속적 감각적 쾌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가운데 삶에 임하기 쉽다. [순세파 Lokāyata]
또 그 소멸에 대해서도 크게 슬픔과 분노의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과를 대단히 짧게 관찰한다.
그런 가운데 짧은 기간에 국한된 잘못된 목표를 추구한다.
그리고 또 잘못된 방안을 취해 행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생사과정에서 장구하게 생사고통을 받아가게 된다.
결국 이런 잘못된 상견과 단견은 문제다.
이런 경우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상견과 단견을 취하게 되는 배경사정
상견과 단견은 극단에 치우친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그런데 한 주체는 자신에 대해 집착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취하는 상견과 단견이 특히 문제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상견과 단견을 취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
그래서 그 배경사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현실 내용 가운데는 있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불이나 폭발물과 같다.
또는 우유나 생선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들은 곧바로 썩어 없어진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금은보석이나 바위등과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을 떠 금을 본다.
그런 경우 금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그 모습과 성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각 물체가 변화를 한다.
그래도 일정하게 산은 산, 물은 물, 바위는 바위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각 내용을 이처럼 일정하게 파악한다.
그런 경우 이들 안에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잘못 여긴다.
즉 영원하고 고정된 뼈대가 그 안에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정으로 현실에서 이런 내용을 얻게 된다고 여긴다.
한편 한 주체가 일정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다.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오랜 기간을 놓고 살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이에서 노인으로 생로병사과정을 거친다.
그렇지만, 또 이런 다양한 모습을 모두 한 주체로 일정하게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영원하고 고정된 참된 자신의 뼈대가 있다고 또 여긴다.
즉, 참된 자신의 주체가 이 안에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사정으로 현실에서 그처럼 매 순간 그런 내용을 얻게 된다고 여긴다.
한편, 이런 내용은 앞에 살핀 신견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신견을 살필 때 선천적인 구생기 신견 문제를 살폈다.
그런데 상견도 이런 구생기 상견이 역시 문제된다.
즉,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으키는 망상분별이 문제된다.
즉, 처음 근본정신과 제7식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구생기 신견]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앞과 같은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구생기 상견]
즉 그런 부분이 영원한 존재라고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이를 집착해 취한다.
한편 단견을 잘못 취한다.
이 배경사정을 살펴보자.
현실 내용 가운데는 오랜 기간 유지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금이나 산, 바위 등과 같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곧바로 없어지는 내용도 많다.
예를 들어 우유나 생선 등과 같다.
이들이 일정시간이 지나 없어진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다음 생각을 갖게 된다.
어떤 것이 한번 사라진다.
그러면 이는 아주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쉽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짧은 기간을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한 주체는 일정하게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생사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경우 다시 그 모습을 이전처럼 대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자신은 사라진다.
그러면 이는 아주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게 된다.
한편 단견도 상견처럼 구생기 단견이 역시 문제된다.
즉,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망상분별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처음 근본정신과 제7식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구생기 신견]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앞과 같은 망상분별을 일으킬 수 있다. [구생기 단견]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대단히 짧은 기간에 국한해 잘못된 목표를 추구한다.
♥Table of Contents
▣- 상견과 단견의 제거방안
상견과 단견의 두 극단에 치우쳐 임한다.
그러면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상견과 단견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유무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이들 문제는 결국 유무의 극단 문제와 성격이 같다.
예를 들어 있고 없음을 분별하려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문제 삼을 어떤 a를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a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a의 유무, 생멸, 상단을 다 함께 논의할 수 없다.
이를 이미 무상상매ㆍ공삼매의 내용에서 살폈다.
유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있고 없음의 분별 자체가 관념영역 안의 문제다.
그런데 <감각현실> 영역에서 그런 관념 내용에 일치한 상(相)을 본래 얻을 수 없다. [무상삼매]
더욱이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 역시 얻을 수 없다.[무아, 무자성]
그리고 본바탕 실재영역에서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실재는 공하다. [공삼매]
그래서 있음[有] 없음[無]의 분별 자체가 본래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또한 같은 사정으로 '없다가 있음'[生], '있다가 없음'[滅]
또한 '늘 영원히 없음', '영원히 있음'[常] '있다가 아주 없음'[斷]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모두 망상분별에 해당한다.
즉 유ㆍ무, 생ㆍ멸, 상ㆍ단 등의 분별이 모두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경전에 제시된다.
...
이 안에서는 오히려 눈의 영역 등도 얻을 수 없거늘
하물며 그것의 항상함과 덧없음이 있겠는가.
...
(『대반야바라밀다경』 제146권 제30품 교량공덕품 44)
따라서 상(常) 무상(無常)의 분별을 모두 떠나야 한다.
이는 다른 분별도 마찬가지다.
♥Table of Contents
▣- 무상ㆍ고ㆍ무아ㆍ부정을 기초적으로 제시하는 사정
근본적으로는 유(有)ㆍ무(無), 상(常)ㆍ단(斷), 생멸(生滅) 이들 견해를 모두 떠나야 한다.
또한 무상(無常)ㆍ상(常), 고(苦)ㆍ락(樂), 무아(無我)ㆍ아(我), 정(淨)ㆍ부정(不淨) 등 치우친 분별도 모두 떠나야 한다.
그러나 수행 예비단계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무상(無常)ㆍ고(苦)ㆍ무아(無我)ㆍ부정(不淨) 이런 측면을 먼저 강조한다.
예를 들어 3현 가운데 별상념주 총상념주의 경우가 이와 같다.
몸의 부정(不淨)ㆍ감수의 고(苦)ㆍ심의 무상(無常)ㆍ법의 무아(無我)를 먼저 관한다.
그래서 각 경우 경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서로 다른 내용이 제시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생사현실에서 망상분별- 업-생사고통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일단 3악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일단 업부터 먼저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데 업은 망상분별과 집착에 바탕해 행한다.
따라서 일단 그런 업을 일으키게 하는 집착부터 일단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 '있는' 내용에 집착을 갖는다.
즉 유(有)에 먼저 집착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영원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보다 강한 집착을 갖게 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긴다.
영원하다[상常]ㆍ즐겁다[락樂]ㆍ참되고 실다운 진짜다[아我]ㆍ깨끗하고 좋다[정淨] [상ㆍ락ㆍ아ㆍ정]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집착한다.
그래서 먼저 이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이들 견해를 제거하는 방편을 취한다.
그래서 부정(不淨)ㆍ고(苦)ㆍ무상(無常)ㆍ무아(無我)의 측면을 관하게 한다.
현실에서 일정한 관계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러나 이들 내용 일체는 그 관계를 떠나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를 통해 현실 내용이 영원하다는 견해를 제거하게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떠 금을 본다.
그러면 그런 금은 늘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그에 대해 집착을 갖는다.
그러나 이렇게 눈으로 얻는 내용 일체는 눈을 감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들 일체는 그런 측면에서 영원하지 않다.
즉, 무상(無常)하다.
그래서 일단 현실에 갖는 집착을 완화시킨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다.
생사과정에서 3악도의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단멸관이 문제된다.
단멸관을 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죽음 이후 자신과 관련된 일은 아주 없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 경우 이에 바탕해 생사현실 문제를 대단히 좁고 짧고 얕게 관한다.
그리고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역시 잘못된 방안으로 추구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생사과정에서 장구하게 생사고통에 묶인다.
이런 경우는 일단 그런 단멸관을 제거해야 한다.
이처럼 단(斷)에 치우친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무량겁에 걸친 생사윤회를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상락아정의 상태를 제시하게 된다. [열반경]
예를 들어 눈으로 본 금 모습이 있다.
이는 눈을 감으면 사라진다.
그런 경우 이제 금은 반대로 사라져 아주 없어진다고 잘못 여긴다.
이런 사정으로 단멸관을 취한다고 하자.
그러나 다시 눈을 떠 대한다.
그러면 다시 그 금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사라진다고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단멸관의 입장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생사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생사와 관련해서도 상견과 단견을 제거해야 한다.
우선 자신의 자아가 영원불멸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상견을 잘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또 반대로 단멸관도 잘 제거해야 한다.
한 주체가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한 주체가 죽음으로 생을 마친다.
그렇다고 죽음 이후 자신과 관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또 다음 생을 이어간다.
이는 생사윤회 현실이다.
이는 망집에 바탕해 전개된다.
즉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생사윤회를 이어간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짧게 관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생사에 걸쳐 전개되는 업과 과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한번 행한 업은 무량겁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량겁에 걸쳐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상견과 단견의 극단적인 2 변을 모두 떠나야 한다.
결국 한 주체의 생사과정에 대해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사윤회의 과정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한 주체는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일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이런 내용을 매순간 얻어내게 된다.
여기에는 배경 사정이 있다.
이는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 )))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매생 매 순간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임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매순간 표면 의식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는 매순간 얻어진 내용 일부를 취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매순간 표면에서 얻는 내용이 변화해간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죽 이어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한생 안에서 자신의 생로병사의 과정의 모습이 된다.
그러나 생사 전후에서도 그 사정이 이와 같다. [생사윤회]
즉 이런 근본정신 자체는 생사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생사 전후 세계와 생명 형태를 달리한다.
그런 가운데 상속이 전개된다.
그래서 생사 전후에 걸쳐 이처럼 표면에서 얻는 내용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취해 매순간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죽 이어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이 한 주체의 생사 윤회과정의 모습이 된다.
그런데 이런 생사과정을 살핀다고 하자.
이 때 무엇을 진정한 자신으로 놓고 살피는가가 다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번 판단이 달라진다.
먼저 자신에 대해 상견을 취하는 입장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경우 근본정신에 바탕한 구조와 기제 )))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 경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가 그런 참된 자아인 것으로 여기기 쉽다. [보특가라, 인상]
즉 이를 생사윤회의 주체로 여긴다. [보특가라補特伽羅, 인人, 삭취취數取趣. pudgala ]
그런 경우 참된 자아가 이런 형태로 늘 존재한다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상견을 잘못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도 '참된 진짜' 자신은 역시 아니다.
즉 실체로서의 자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견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해심밀경』 1권 3. 심의식상품心意識相品)
한편, 한 생의 의식 표면에서 얻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 가운데 일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런 내용만을 참된 자신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쉰 전후를 살펴본다.
엄밀하게 보면 호흡하나로도 자신의 육체적 내용은 달라졌다.
또 생각이 한번 일으키고 사라지는 전후를 살펴본다.
엄밀하게 보면 이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정신적 내용은 달라졌다.
따라서 찰나 전후로도 계속 유지되는 자신은 세우기 곤란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상견을 유지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런 입장에서는 매 찰나 단견의 입장을 취해야 할 듯하다.
이제는 자신에 대해 단견을 취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다.
그런 경우 자신이 5살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또 반대로 자신이 5살 되던 때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순간 자신으로 여기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런 경우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순간 없다.
몇 십 년이 지나면서 그런 내용은 사라져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모두를 다 자신으로 여긴다.
즉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변화한 각 내용을 다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 사정이 무언가를 살펴야 한다.
-- 인과연속관계
이들이 단순한 인과 연속관계로 이어져서 그렇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 주체가 변화해간다.
그런데 그 전후에 인과관계에 있는 내용을 모두 나열한다.
그래서 이 모두를 한 주체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한 주체가 섭취하는 채소나 음식이 있다.
이것도 현재 자신의 원인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들도 자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 주체가 배설행위를 한다.
그런 경우 이 배설물도 자신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자신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한편 정신적으로는 한 주체가 지식을 습득한다.
그런 경우 이런 지식이나 책 내용도 현재 자신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들도 자신의 정신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자신이 지식을 말하거나 글로 전달한다.
그런 경우 이들 내용도 자신과 인과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자신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 내용을 모두 자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 공통요소
한편, 이 변화과정 전후에 공통한 요소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즉, 어떤 하나의 요소가 계속 핵심으로 들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이들 각 모습을 한 주체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갓난 아이 시절의 모습과 노인이 된 모습들이 있다.
엄밀히 보아 이들은 그 정신적, 육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르다.
이들은 결국 생사윤회 과정의 일부다.
이 사정을 이미 앞에서 제시했다.
즉, 현실에서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는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 )))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는 매순간 얻어진 내용 가운데 일부를 취한다.
그리고 이를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죽 이어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한생 안에서 자신의 생로병사 과정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갓난아이와 노인을 모두 한 주체의 모습으로 관하게 된다.
그런데 한 생의 범위를 놓고 살핀다고 하자.
이 경우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자신이 유지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대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평소 그의 몸으로 여겨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생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라져 없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죽어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다.
그러면 이후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리고 이후 그런 몸 부분과 관련되어 이어지는 내용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후 그 주체는 아주 없어진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단멸관]
그러나 이런 단멸관은 잘못이다.
즉 근본정신은 생사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생사 전후 세계와 생명 형태를 달리한다.
그런 가운데 상속이 전개된다.
그리고 생사 전후에 걸쳐 표면에서 얻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죽 이어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이 한 주체가 윤회해가는 생사윤회의 모습이 된다.
다만 그 내용은 인간과 축생 하늘중생 이런 형태로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한 생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 전후의 달라진 모습을 다 함께 하나의 주체로 보기 힘든 것뿐이다.
망집에 기초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러면 매 순간 이런 내용을 취한다.
그리고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삶을 이어간다.
그런데 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혹-업-고의 연기관계]
즉 현생에서 일정한 업을 행한다.
그러면 후생에서 그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3악도 생사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를 생사과정에서 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3악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경전에 다음 게송이 전한다.
가령 백겁을 지내어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나니
인과 연이 마주칠 때에
과보를 저절로 받게 되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제18권)
이런 3악도 생사고통을 일단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10선업부터 잘 닦는다.
그래서 악업을 중단한다.
그래서 우선 3악도를 벗어난다.
그리고 인간과 하늘을 오가는 상태가 된다. [인천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후 근본적으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경우 일단 계부터 잘 성취한다.
그리고 업의 장애를 제거한다.
그리고 복덕자량을 구족한다.
그런 바탕에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다.
그리고 근본번뇌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상(常)과 단(斷)의 입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상견을 취한다.
그러면 자신에 집착을 심하게 갖는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반대로 단견을 취한다.
그러면 너무 짧게 관한다.
그리고 한 생에 국한해 목표와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생사과정에서 장구하게 생사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일단 벗어나야 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을 정진해야 한다.
상(常)에 치우친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무상(無常)을 먼저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상견을 벗어나도록 한다.
그러나 한편 단(斷)견에 치우친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또 반대로 루량겁에 걸친 생사윤회를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러면 양 입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잘못 여길 수 있다.
즉 이에 대해 다음처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견이 잘못이라고 하자.
그러면 단견을 취해야 할 듯하다.
그런데 단견이 또 잘못이라고 하자.
그러면 반대로 상견을 취해야 할 듯하다.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기 쉽다.
그리고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어떻게 보면 입장이 모호해 보인다.
그래서 각 입장을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상대의 입장 때문이다.
상대가 2분법상의 망상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상대가 판단 기준을 매번 달리한다.
그런 사정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유ㆍ무, 생멸, 상ㆍ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상견과 단견을 우선 급하게 제거해야 한다.
우선 당장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일으키는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초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있다.
무상(無常)ㆍ고(苦)ㆍ무아(無我)ㆍ부정(不淨)이 그 내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제시된 배경사정이 있다.
각 주체는 상견과 단견으로 당장 부작용을 겪는다.
그래서 일단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런 상견과 단견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업을 중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망집 상태에서도 쉽게 이해할 방편을 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편상 기초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상대가 2분법상의 망상분별을 행하는 상태다.
그런 경우 일단 그 상대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상대가 그런 망상분별과 집착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들이 방편상 기초적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시된 배경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2분법상의 유무 분별과 망집
어떤 이가 2분법상의 망상분별을 행한다.
이런 경우 다음처럼 매번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먼저 현실에서 무엇인가 집착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다.
이를 a 라고 표시해보자.
현실에서 본래 그런 a 자체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이미 무상삼매와 공삼매를 살피면서 보았다.
[참고 ▣- 무상삼매 ]
<감각현실>에서 그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얻을 수 없다. [무상삼매]
또한 그에 해당한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도 없다.
한편 본바탕 실재에서도 그런 내용은 얻을 수 없다. [공삼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단지 관념 영역에서만 있다.
그런 내용일 뿐이다.
그런데 유(有)ㆍ무(無), 상(常)ㆍ단(斷), 생멸(生滅), 무상無常)등의 여러 분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단지 관념영역에서만 있다.
즉, 관념분별 내용일 뿐이다.
그런데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러면 일단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a라고 여기며 임한다.
그리고 현실에 그런 a가 있다고 여긴다.[有]
그리고 그에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인다.
그런데 우선 생사고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그런 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그에 대한 집착을 우선 당장 제거해야 한다.
본래 있음[有]과 없음[無] 이런 두 판단이 다 함께 잘못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무 양변을 함께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일단 현실에서는 있다[有]는 분별을 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일으키는 집착의 폐해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일단 있다[有]는 망상분별과 집착을 떠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먼저 '있음[有]'을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방편상 그것의 무[無]를 제시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경우 없음을 통해 있다[有]는 집착은 일단 제거한다.
그런데 상대가 여전히 망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는 여전히 2분법상의 분별을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위 내용을 통해 다시 '없음'의 입장을 취한다.[無]
그리고 다시 무[無]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일체 생사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임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이런 부작용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있음[有]을 방편상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무 양변의 치우친 분별을 함께 떠나야 한다.
그런데 상대가 이를 통해 끝내 망집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유무 2분법상 분별에 매여 있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있음[有]과 없음[無] 양변만 치우쳐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유와 무의 분별 문제에서부터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본래 이런 방편을 취하는 사정이 있다.
그것은 상대가 그런 망집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가 망집에 바탕해 2분법상 분별에 매여 있다.
그래서 그런 상대에 맞추어 임해야 한다.
즉 그런 상태의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사정으로 앞과 같은 방편적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있음[有]과 없음[無] 각 분별 집착을 일단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2분법상의 상단 분별과 망집
2분법상의 분별과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러면 나머지 상(常)ㆍ단(斷), 생멸무상(生滅無常)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
유무 분별의 극단은 상견과 단견에서 다시 나타난다.
먼저 다음처럼 분별하는 경우가 있다.
-- <시간상 지금 있다. 그리고 이후 또 있다. 그런 형태로 죽 늘 있다.>
또는 반대로 무의 극단을 취한다.
그러면 다시 단견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다음처럼 분별한다.
-- <지금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사라진다. 그리고 이후 전혀 없게 된다.>
이렇게 분별한다.
이들은 유무 관념으로 조합한 복합관념이다.
그런데 이런 복합관념으로 다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경우들이다.
<없고 없고 죽 늘 없다>
<없다가 한번 있다. 그러면 이후 죽 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무언가 유무를 논의하려 한다.
그러면 일단 유무를 논의할 a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없고 없고 죽 늘 없다>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그런 논의를 할 a가 없다.
그래서 논의대상으로 처음부터 되지 않는다.
또 현실에서 이에 집착과 업을 일으킬 경우가 드물다.
한편 <이전에는 없다. 그런데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 죽 있다>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없다> 이 부분은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논의를 할 a가 없다.
그래야 이를 전제로 유무 논의가 행해지기 곤란하다.
다만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 죽 있다>는 부분은 상견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순히 유무로 조합해 여러 복합 관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비교적 적다.
다만 생멸은 현실적인 논의대상이 된다.
생은 <무에서 유>로의 변화다.
멸은 <유에서 무>로의 변화다.
무언가 a가 '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자.[常]
이 경우는 단순히 유에 집착하는 경우보다 더 이를 실답게 여긴다.
그리고 더 집착한다.
그래서 폐해가 한층 심하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 있고 없음 분별 자체가 잘못이다.
따라서 늘 있다는 상견은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그래서 상견을 부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견도 마찬가지다.
'있다가 없다. 그 이후로는 죽 아주 없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자.[斷]
이 역시 없음에 치우친다.
그리고 짧은 기간만 고려한다.
그리고 잘못 현실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있고 없음 분별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결국 상견과 단견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생멸 무상을 제시해 부정하게 된다.
생멸이 일단 이해하기 쉬운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상견과 단견을 제거한다.
생(生)은 <'없다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멸(滅)은 <'있다가 없게 됨'>을 의미한다.
즉, <'있다가 없다.'> 그리고 <'없다가 있다'>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상견과 단견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생하고 멸한다>. 이를 반복한다. => 그래서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멸한다. 그러나 또 다시 생한다> => 그래서 한번 사라진 후 죽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상견과 단견의 망집번뇌를 일단 제거한다.
그러나 이는 일단 상견과 단견을 제거하는 임시적 방편이다.
상견과 단견의 폐해가 심하다.
그런데 생멸은 일반 입장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사정으로 사용하는 임시적 방편이다.
♥Table of Contents
▣- 2분법상의 생멸 분별과 망집
생멸(生滅)이나 무상(無常)을 관한다.
그러면 이를 통해 상견과 단견의 망집번뇌를 일단 제거할 수 있다.
생멸의 경우 극단적 입장으로는 찰나생멸설도 있다.
다만 무상은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니다.
즉 반드시 찰나에 생하고 멸하는 경우만 무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1겁 동안 있다가 찰나만 없다.
이런 경우도 무상(無常)이다.
물론 찰나생멸도 무상이다.
그러나 여하튼 생멸을 통해 상견과 단견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이 둘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망집에 바탕해 2분법상의 분별을 행한다.
그런 경우 이를 통해 다시 생멸(生滅)이나 무상(無常)에 집착한다.
그런 경우 생멸이나 무상의 분별도 문제다.
이 역시 유무의 잘못된 분별에 바탕한다.
이런 경우 본바탕 실상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현실 내용의 정체도 역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
결국 생사현실에서 유무와 생멸 분별 자체를 떠나야 한다.
『중관론』 등에서는 이런 사정으로 8부중도를 제시한다.
즉, 불생불멸(不生不滅)ㆍ불상부단(不常不斷)ㆍ불일불이(不一不異)ㆍ불래불출(不來不出)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 언설로 표현한 제일의제와 망집
실상과 현실의 본 정체를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본래 생멸과 생사를 얻을 수 없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불생불멸(不生不滅)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생멸을 부정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분법상의 분별에 바탕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유무에 대한 망상 분별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불생(不生) 불멸(不滅)의 표현에서도 다시 불(不)에 집착한다.
그래서 마치 실상은 생하지 '않음'이 그처럼 있다고 오해한다.
또는 반대로 다음처럼 오해한다.
예를 들어 무언가가 생하고 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경우 그런 사정으로 그것이 곧 실재 내용이라고 오해한다.
그래서 위 표현이 나타내고자 한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
현실 일반적 입장에서 분별하여 옳다고 보는 내용이 있다.
이를 세제(世諦)라고 칭한다.
반면 실재의 입장에서 언설분별을 떠난 진리가 있다.
이를 제일의제 또는 진제(眞諦)라고 칭한다.
그런데 언설을 통해 제일의제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런 경우 언어 표현은 본래 2분법적인 바탕에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여전히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경우 2분법적인 분별 안에서 이런 2분법적 자세를 벗어날 방편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불생(不生) 불멸(不滅) 표현 앞에 비(非)를 붙여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불생(不生) 비불생(非不生)이런 표현을 한다.
이는 본래 그런 내용을 모두 다 함께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음 불생(不生)의 표현으로 일정한 오해를 한다.
그래서 다시 비(非)를 앞에 붙인다.
그래서 그런 망집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길장(吉藏)의 3종중도(三種中道)설에서는 다음 내용도 제시된다.
먼저 현실측면에서 실재의 공함을 중도적 입장에서 살핀다.
그래서 본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생멸(無生滅)인 생멸(生滅)을 제시한다. [세제중도]
한편 다시 무아 공인 실재 측면에서, 현실을 중도적 입장에서 함께 살핀다.
그래서 생멸(生滅)인 무생멸(無生滅)을 제시한다. [진제眞諦 중도]
한편, 앞에 설한 내용을 다시 다 함께 부정한다.
이는 언어사려 분별을 모두 떠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생멸(非生滅)이면서 비무생멸(非無生滅)이라고 제시한다.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비속비진중도(非俗非眞中道)](『중론소』 권1)
경전과 논서에서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 본 취지는 상대에 맞추어 망집 분별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
언어표현은 그런 취지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14무기와 망집
불생불멸(不生不滅) 이런 표현이 제시된다.
또는 비생멸(非生滅), 또는 비무생멸(非無生滅) 이런 표현이 제시된다.
그러나 2분법상의 망집을 벗어나오지 못할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 여전히 혼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유ㆍ무, 상ㆍ단, 무상, 생멸, 이런 2분법 분별체계 안에서 헤매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끝내 망집 번뇌를 벗어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 설명도 효용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경우는 부처님은 무기설의 입장을 취하게끔 된다.
즉 유무 문제에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임하게 된다.
이런 성격의 논의에 14무기설이 있다.
즉 망집에 묶인 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세간(世間)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영원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한가.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은가.
[世間常, 世間無常, 世間亦常亦無常, 世間非常非無常]
세간(世間)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世間有邊, 世間無邊, 世間亦有邊亦無邊, 世間非有邊非無邊]
여래(如來)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如來死後有, 如來死後無, 如來死後亦有亦非有, 如來死後非有非非有]
명(命)과 신(身)은 하나로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命身一, 命身異]
( 『잡아함경』 제16권 408, 제34권 962, 『중아함경』 제60권 전유경(箭喻經) 제10)
상대가 망집에 묶인 가운데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
그런 경우 부처님께서 어느 형태로든 일체 답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이는 이치(義)에 합당하지 않다.
법(法)에 합당하지 않다.
또한 범행(梵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智)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覺)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열반(涅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설하지 않는다.
...
이런 견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생로병사와 슬픔ㆍ울음ㆍ근심ㆍ괴로움ㆍ번민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생사고통의 해결에는 4제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4제법은 위와 같은 논의와 같지 않다.
그래서 4제법을 설한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여야 할 것>은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밝히고 있다.
♥Table of Contents
▣- 상대의 입장에 맞춘 망집제거 방편
부처님께서 상(常)과 무상(無常)에 대해 언제나 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잡아함경』 첫 부분에서부터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함을 볼 수 있다.
"색(色)은 무상(無常)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은 바른 관찰[正觀]이니라."
(『잡아함경』 제1권)
한편,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위 14무기설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 나온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대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판단을 한다.
‘나(我)와 세간은 항상하다’[아급세간我及世閒 상常]
‘나와 세간은 덧없다’[아급세간我及世閒 무상無常]
‘나와 세간은 항상 하기도 하고 덧없기도 하다’[아급세간我及世閒 역상역무상亦常亦無常]
‘나와 세간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덧없는 것도 아니다’[아급세간我及世閒 비상비무상非常非無常]
‘나와 세간은 끝이 있다[유변有邊]’[아급세간我及世閒 유변有邊]
‘나와 세간은 끝이 없다[무변無邊]’[아급세간我及世閒 무변無邊]
‘나와 세간은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다’[아급세간我及世閒 역유변역무변亦有邊亦無邊]
‘나와 세간은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아급세간我及世閒 비유변비무변非有邊非無邊]
‘목숨[명자命者]이 곧 몸이다’[명자즉신命者卽身]
‘목숨은 몸과 다르다’[명자이신命者異身]
‘여래는 돌아가신 뒤에 계신다’[여래사후如來死後 유有]
‘여래는 돌아가신 뒤에 계신 것이 아니다’[여래사후如來死後 비유非有]
‘여래는 돌아가신 뒤에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다’[여래사후如來死後 역유역비유亦有亦非有]
‘여래는 돌아가신 뒤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다’[여래사후如來死後 비유비비유非有非非有]
이와 같이 다양하게 집착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실이요 나머지는 다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한다.
...
(『대반야바라밀다경』 305권 41. 불모품 ②)
그리고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설하신다.
...
즉, 색 수ㆍ상ㆍ행ㆍ식이 진여(眞如)와 같다.
법계(法界)와 같다.
법성(法性)과 같다.
허망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분별이 없다.
형상이 없다.
작용(作用)이 없다.
희론(戱論)이 없다.
얻을 바도 없다.
...
(『대반야바라밀다경』 305권 41. 불모품 ② (K0001 v3, p.33c01-p.41a01)
이렇게 제시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부처님께 다음처럼 질문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즉 어떤 경우는 이에 대해 답을 하신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 연유가 무엇인가.
(『잡아함경』 961.유아경 915. 도사씨경)
결국 앞과 같은 사정이다.
상대가 망집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설을 통해 망집을 벗어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망집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언설을 통해서도 2분법적인 극단에 끝내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약의 처방을 달리한다.
그 사정은 이미 살폈다.
생사현실에서 망집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현실에 망집번뇌-업-생사고통의 인과관계가 있다. (혹업고)
이론상으로만 이 문제를 살핀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망집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본 망집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그 제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상대가 망집번뇌에 깊이 묶인 상태다.
그런 경우는 일단 그 망집을 그대로 둔다.
그 상태에서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일단 급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업을 중단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업을 행하게 되는 번뇌부터 먼저 제거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후 제거가 쉬운 번뇌부터 하나하나 제거해간다.
그런데 이 순서를 뒤바꾼다.
그러면 오히려 처음부터 망집번뇌를 제거하기 힘들게 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심하게 받는 상태에 처한다.
그런 경우 오히려 이후 번뇌제거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수행의 처음 단계에서는 기초적 번뇌제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일단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경우 상단에 치우친 번뇌부터 제거한다.
이런 견해가 집착을 강하게 갖게 한다.
그런 경우 일단 일체가 무상이라고 설한다. [제행무상]
그리고 이에 의해 일단 상견과 단견을 제거한다.
그래서 그에 바탕한 업을 중단한다.
그런 경우 처음 목표 상태는 성취된다.
그래서 상대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렇게 설하게 된다.
그러나 14무기설 경우를 보자.
이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상대가 먼저 4구분별로 나누어 질문을 한다.
그런 상태의 상대에게 무상을 설한다고 하자.
그 경우 무상으로 상견은 제거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다시 무상을 취해 치우쳐 고집하게 된다.
그래서 끝내 4구 분별체계에 갇힌다.
그리고 망집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언설분별로 어떤 형태로던 답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래도 이를 통해 상대가 망집 번뇌를 제거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체 언설로 답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각 상대의 상황과 상태가 각기 다르다.
그런데 한편, 기본 수행을 잘 성취한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계를 비롯해 정과 혜의 수행이 잘 성취된 상태다.
그리고 이미 생사고통 묶임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런 경우 이제 근본적 번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사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경우 이와 관련된 제일의제를 잘 증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체 분별이 본래 망상분별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무상(無常)ㆍ상(常), 고(苦)ㆍ락(樂), 무아(無我)ㆍ아(我), 정(淨)ㆍ부정(不淨)
그리고 유(有)ㆍ무(無), 상(常)ㆍ단(斷) 생멸(生滅) 무상(無常)에 대해서도 분별을 다 함께 떠나야 한다.
그래서 깊은 제일의제에 대해 설하시게 된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결국 설법을 듣는 상대의 상태에 따른 차이다.
♥Table of Contents
▣- 망집에 바탕한 62견
상견과 단견에 관련하여 외도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많다.
그래서 이를 다양한 형태로 62견으로 묶어 나열한다. [六十二見, dvāṣaṣti dṛṣtayaḥ]
이들은 앞에서 살핀 14무기설과도 관련된다.
경전과 논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외도의 62견이 제시된다.
먼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3세(世)에 각각 5온(蘊)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낱낱이 4구(句)의 이견(異見)을 배열한다.
과거 5온에 상(常) 무상(無常)과 관련된 다음 4구를 배당한다. [常ㆍ無常ㆍ常無常ㆍ非常非無常]
현재 5온에 변(邊) 무변(無邊)과 관련된 다음 4구를 배당한다. [有邊ㆍ無邊ㆍ有邊無邊ㆍ非有邊非無邊]
미래 5온에 시후 여래 존부, 생사왕래와 관련된 다음 4구를 배당한다. [如去ㆍ不如去ㆍ如去不如去ㆍ非如去非不如去]
그리고 다시 신(神)과 신(身)이 동일한가. 다른가의 문제를 배당한다.
(참조 『마하반야바라밀경』 권14 불모품 제48, 『대지도론』 권70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소』 )
이는 앞에서 살핀,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내용과 관련된다.
『대지도론』은 『마하반야바라밀경』의 해설서다.
그리고 『마하반야바라밀경』은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축약한 판본이다.
그래서 큰 차이는 본래 없다.
다만 이를 62견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구조로 다만 4구만 달리 배당한 형태도 있다.
즉 과거에 如去 등 4구, 현재에 常등 4구, 미래에 有邊 등 4구를 배당하는 형태다.
또는 5온과 아(我)의 관계로서 4구를 만들어 살피는 형태도 있다.
다음 형태로 분별한다.
색(色)이 곧 아(我)다. [色是我]
색을 떠나 아(我)가 있다. [離色而有我]
색은 크다. 아(我)는 작다. 아(我)는 색 가운데 머물러 있다. [色為大,我為小,我住於色中]
아(我)는 크다. 색은 작다. 색은 아(我) 가운데 머물러 있다. [我為大,色為小,色住於我中]
그리고 다시 수ㆍ상ㆍ행ㆍ식에 위 형태를 적용한다.
한편, 또는 본겁본견의 설 18종, 말겁말견의 설 44종으로 62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본겁(本劫)은 과거시를 말한다.
그리고 본견은 과거에서 상견(常見)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말겁(末劫)은 미래시를 말한다.
그리고 말견은 미래세에서 단견(斷見)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다만 각 경전과 논서에서 개별 명칭에 표현차이가 있다.
『유가사지론』 제87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열된다.
옆 [괄호]에 『장아함경』의 표현을 부기해 놓기로 한다.
18제악견취(十八諸惡見趣) - 18견
-상견론(常見論) -[包括常論] - 4견
-일분상견론(一分常見論) [亦常亦無常論]- 4견
-유변무변상론(有邊無邊想論) [邊無邊論] - 4견
-불사교란론(不死矯亂論) [種種論]- 4견
-무인론(無因論) [無因而有論]- 2견
44제악견취(四十四諸惡見趣) - 44견
-유상론(有想論)ㆍ유견상론(有見想論) [包括有想論]- 16견
-무상론(無想論) -[無想論] 8견
-비유상비무상론(非有想非無想論) [非有想非無想論]- 8견
-단견론(斷見論) -[斷滅論] 7견
-현법열반론(現法涅槃論) -[現在泥洹論] 5견
(『유가사지론』 제87권, 『장아함경』 권14 범동경 21, 『불설범망육십이견경』, 『대승의장』 제6권,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199권)
이외에도 경론에 따라 달리 62견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 대승법원의림 권4 (남본) 『열반경』 권 23)
그래서 이런 망집에 바탕한 입장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들은 극단적으로 유ㆍ무, 상ㆍ단에 치우친 잘못된 견해이다.
생사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망상분별을 잘 제거해야 한다.
▲▲▲-------------------------------------------
이상은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169 ~183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8장_2유식_2_5위백법.txt
cf 부파불교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 169 ~183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
이하은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연구참조자료/08장_0부파불교.txt
cf 작업중파일/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 184 ~199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Table of Contents
▣- 현실의 유무분별과 망집
각 주체가 망집에 바탕해 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자신>이라고 여긴다.[자신=아]
또 일정한 부분을 <영희>라고 여긴다. [인간]
또 일정한 부분을 <고양이나 꽃>으로 여긴다.[생명=유정]
또 일정한 부분을 <바위나 금>이라고 여긴다. [무생물, 무정물]
이 경우 현실에 이들이 <있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없다>고 해야 하는가.
이들이 <영원하다>고 하는가.
<있다가 사라지면 아주 없어진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멸한다>고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논의가 여전히 일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두는 잘못된 유무 분별에서 비롯한다.
<상ㆍ단>, <유변ㆍ무변> 등의 분별도 모두 이 유무 판단을 그 요소로 한다.
유무 분별을 시간적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극단에 치우친다.
그러면 <상단>의 견해를 취하게 된다.
<'있고 - 또 있고 - 그 이후늘 있음'>이 상(常)에 해당한다.
또는 <'있다가 - 없게 된다. - 그 이후 죽 없다'>는 단멸관에 해당한다.
또 공간적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극단에 치우친다.
그러면 공간과 관련해 <유변ㆍ무변>의 견해를 취한다.
한편 <'없다가 있음'>이 <생>(生)이다.
그리고 <'있다가 없음'>이 <멸>(滅)이다.
그리고 <생멸生滅함>이 <무상(無常)>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 문제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가장 기본 되는 유(有)ㆍ무(無) 판단부터 잘 살펴야 한다.
그런데 '있음[有]'과 '없음[無]'을 문제 삼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분별과정에서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이 이미 앞에 본 다양한 입장들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유무 상단에 치우친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런데 여전히 현실에서는 이들이 문제된다.
특히 이에 따라 <수행 목표>를 달리 정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의 방향>을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 고통 문제를 해결할 때도 <방안>을 달리 취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에 임하는 자세>를 달리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 논의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에서 <유ㆍ무 판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유무판단의 논의 취지 - 실다움 여부의 판단
유무문제를 행한다.
이는 단순히 지적호기심 때문에 살필 수도 있다.
그런데 수행에서 생사고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이를 위해 생사현실과 고통의 정체파악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음이 문제된다.
즉 이들이 꿈과 달리 실다운가.
그리고 이 결론에 따라 그 해결방안이 달라지게 된다.
만일 생사현실이 꿈과 달리, 실답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고통도 실다운 것이다.
그런 경우 그 고통을 겪은 것이 싫다고 하자.
그러면, 오직 그 예방에 철저할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인 업을 중지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꿈처럼 실답지 않다고 하자.
그렇다고 위와 같은 예방 노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방을 위한 수행은 중요하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현실이 꿈과 성격이 같다.
그렇더라도 현실은 완전히 꿈은 또 아니다.
그래서 꿈과 달리, 현실을 실답게 여기게 하는 특징이 많다.
D 감각 현실은 대단히 다양하고 생생하게 매 순간 얻는다.
E 그리고 감각현실 각 부분 특성이 달리 파악된다.
그래서 자신 - 인간 - 다른 생명체 - 무정물 부분의 특성이 다르다.
F 현실은 또 다수 주체가 일정 시기와 상황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일정 결과를 반복해 얻는다.
G 그리고 현실은 꿈과 달리 단지 각성만으로 깨어나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현실은 꿈과는 달리, 각 주체가 대단히 실답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 정도만큼 생사 고통도 실답게 여기며 겪게 된다.
현실은 꿈과 비슷한 성격이 일부 있다.
그렇다해도 이런 사정으로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답지 않더라도, 생사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경우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잘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방을 위한 수행을 훨씬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사고통은 번뇌 - 업 - 생사고통의 관계를 통해 받는다.
그래서 먼저 이를 받게 하는 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현실 내용에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실내용이 실답지 않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집착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업을 훨씬 쉽게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앞의 예방 수행과정의 어려움은 다음이다.
장차 겪을 생사고통은 먼 미래의 일이다.
그래서 당장 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닦는 수행은 지금 행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 수고와 고통은 지금 당장 감각하고 느낀다.
그래서 예방노력을 대단히 힘들게 여긴다.
그런데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훨씬 덜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행도 원만히 성취하게 된다.
한편 앞 기본 수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래서 보시, 10선법, 계 등이 구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생사 고통을 심하게 받는 3악도에 처한다.
또는 현실에서 극심한 빈곤,질병, 장애, 낮은 신분, 감옥 등에 처하게 된다.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현실에서 복덕이 없는 상황에 묶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계를 갖추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다.
그래야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벗어난다.
그리고 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혜를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기초로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 생사현실이 꿈과 성격이 같다고 하자.
그래서 실답지 않다고 하자.
그래서 수행자가 이를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앞의 기초 수행과 함께 생사고통 해결의 폭이 넓어진다.
이 경우 생사고통을 당면한 상황에서도 극복에 도움이 된다.
즉 현실을 꿈처럼 관한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방안이 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를 통해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
현실을 실답게 여긴다고 하자.
그러면 탐욕과 분노에 대한 집착도 끊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집착을 훨씬 더 잘 끊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적 망집 번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견혹 제거)
한편 생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한 생사 고통을 당면해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실이 공하고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고통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런 이해만으로 그 상황 자체를 변경시키기는 힘들다.
또 그런 이해만으로 그 상황에서 곧바로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런 이해로 그 고통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을 평안이 참고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수행을 닦아 점차 정서적 의지적 번뇌도 완전히 제거해 갈 수 있다. (수혹 제거)
그래서 생사 묶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이후 그런 기초에서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승 수행과정에서의 공사상의 중요성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생사현실의 고통도 그대로 받아들여 좀 더 평안히 참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승 수행에서는 바로 이 측면이 중요하다.
대승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중생과 함께 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는 성문 연각승 수행과 수행 방향이 반대가 된다.
성문 연각승은 수행자가 생사현실을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3계 생사를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이는 마치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신만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대승 수행은 이와 입장이 반대가 된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가 되려는 경우와 같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이의 병을 다 함께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환자가 있는 병원에 들어가 활동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유함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래서 대승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일부로 찾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중생이 고통받는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 수행자도 어느 정도 생사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수행자부터 이런 생사과정을 피하면 안된다.
이를 두려워해서 다른 이를 구호하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 일체 생사현실을 꿈처럼 관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어떤 경우도 기본적으로 평안히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그대로를 니르바나 상태로 관한다.
즉 생사현실 안에서 마치 생사묶임을 벗어난 상태처럼 여여하게 임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의 중생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해 갈 수 있다.
따라서 대승 수행과정에서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되게 된다.
( fr 중관사상)
0627#
그런데 어떤 내용이 실답지 않음을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른 영역에 그 내용이 그처럼 그대로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또 꿈과 다른 특성을 갖는 실체적 존재인가가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실답지 않음의 판단
현실에서 침대에 누워 바다 꿈을 생생하게 꾸었다.
그 꿈 자체는 생생하다.
그리고 꿈에서는 바다가 있다고 여긴다.
꿈에서는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그런 바다는 꿈에서는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바다가 <있다>고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꿈을 실답지 않다고 여긴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A 꿈은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만 임시적으로 얻는 내용일 뿐이다.
즉 그런 조건과 상황을 떠나면 얻을 수 없다. [조건의존성, 임시성]
B 한편, 꿈 내용은 정작 꿈을 꾼 침대에서는 얻을 수 없다.
즉 꿈 내용을 얻는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C 한편 평소 일정한 내용은 일정한 여러 성품을 갖는다고 여긴다.
그런데 꿈 내용은 그런 성품을 갖지 못한다.
즉 꿈 내용에서는 그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성품들을 얻지 못한다. [가짜성품]
예를 들어 꿈에서 보는 바다 모습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어떤 측면에서는 바다처럼 여겨진다.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붓으로 그린 바다와 같다.
또는 바다를 촬영한 사진과 성격이 같다.
꿈속의 바다는 짜지도 않다.
그리고 배를 띄울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꿈은 실답지 않다고 한다.
꿈은 생생하게 꾸었다.
그래도 꿈은 실답지 않다.
이 경우 꿈이 실답지 않음을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꿈속에서만 꿈을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꿈이 실답지 않음을 파악하기 힘들다.
0627#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 자면서 바다 꿈을 꾼다.
이 경우 바다 모습을 꿈에서 생생하게 꾼다.
그런 경우 이것이 실다운 바다인가를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꿈 안에서 꿈 내용만 살펴서는 알 수 없다.
꿈을 꾼 본바탕인 현실이나 다른 영역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경우 꿈은 침대가 놓인 현실에서 꾸었다.
침대가 놓인 현실은 꿈을 꾼 바탕이 된다.
그래서 침대가 놓인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 각 내용을 서로 대조해 살펴야 한다.
그런 결과 꿈이 실답지 않다고 제시한다.
바다 꿈은 실답지 않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음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그런 바다 꿈을 생생하게 꾸지 않았다.
- 또 침대가 놓인 현실에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꿈은 그 상황에서 생생하게 꾸었다.
=> 즉 꿈은 꿈 영역에 그처럼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그래서 꿈내용도 '있다'.
한편 현실도 그러그러하게 '있다'.
즉, 현실은 현실대로 현실 영역에 그처럼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따라서 침대가 놓인 현실에 아무 것도 없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작 침대가 놓인 현실에서 그런 꿈 내용은 '얻을 수 없다.' .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반대로 꿈 영역에도 현실 내용은 없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따라서 그런 꿈 내용은 실답게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통해 꿈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꿈은 꿈 속에서 꾸어서 그렇게 꿈 속에 '있다'.
그러나 <실답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유무 문제에서 이들 각 내용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한편 현실과 꿈의 정체를 서로 대조해본다.
그리고 이 현실과 꿈 내용을 서로 대조 비교해 본다.
그런 경우 현실에 비추어 보면 꿈은 서로 엉뚱하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 내용과의 정체판단.-이다ㆍ아니다 사실판단]
꿈은 현실이 아니다.
또 현실은 꿈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참된 존재라고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
꿈은 가짜다.
그리고 허망하다.
그런 의미에서 '없는' 내용이라고도 표현한다.
즉 이는 꿈은 <실다운 내용>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꿈은 실답지 않게 '있다'.
그래서 꿈이 실답지 않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꿈내용을 현실에 관통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실도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다.
먼저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이 경우 그 관념이 집착을 가질 만큼 실다운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그 관념의 유무 문제를 살핀다.
이 경우도 앞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 그 내용이 그 영역에 그처럼 얻어져 있음만 판단한다고 하자.
그러면 부족하다.
관념 영역에서 관념은 그렇게 일으켜 얻고 있다.
따라서 관념은 관념영역에 그처럼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어떤 경우 <감각현실>이 관념을 일으킨 바탕이 된다.
이 경우 그런 <감각현실>도 감각영역에서 그처럼 얻어진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그러나 이는 본 유무논의의 초점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은 유무판단과 성격을 혼동하면 안 된다.
여기서 관념의 유무논의는 다음에 초점이 있다.
즉, 이런 관념이 다른 영역에도 그처럼 있는가 여부가 주된 초점이다.
그런 관념이 다른 영역에도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만큼 실다운 내용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실답지 않다.
그런 경우 그런 사정으로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경전과 논서에서는 이런 취지로 주로 유무판단을 하게 된다.
즉, 그 내용이 다른 영역에 그처럼 그대로 있고 없음 여부를 주로 판단한다.
그래서 유무 논의의 초점은 대부분 이 부분을 초점으로 한다.
그래서 이 경우 먼저 <감각현실>영역에 관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 유무판단]
또 더 나아가 본바탕 실재 영역에 관념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각 경우 유무논의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유무논의를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여기서 경전에서 주로 논의되는 유무논의를 기호로 표시해 명확히 이해해보자.
여기서 본바탕 실재를 #, <감각현실>을 ○, 관념을 ■이라고 표시하기로 하자.
그런데 경전에서 일정한 관념내용을 본래 <얻을 수 없다>거나, <없다>고 제시한다.
이는 다음을 나타낸다.
우선 이는 현실에서 그런 <감각현실>○이나 관념■을 얻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일정한 관념■을 그처럼 일으켜 얻는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그런 형태로 있다.
그러나 <감각현실>○에서 그런 관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본바탕 실재#에서도 그런 관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관념내용을 본래 <얻을 수 없다>고 제시한다.
관념과 <감각현실>의 관계는 결국 다음처럼 제시할 수 있다.
<감각현실>에 관념은 얻을 수 없다.
관념에서도 <감각현실>은 없다.
한편 관념을 다른 영역 내용과 대조해본다.
이런 경우 각 내용은 서로 엉뚱하다.
이는 다음이다.
어떤 한 내용을 다른 영역의 내용과 비교한다.
그런 가운데 정체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다ㆍ아니다의 사실판단을 행한다.
즉,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서로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감각현실>에서 관념을 일으킨다.
그래서 일정한 관념은 일정한 <감각현실>을 떠나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현실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념과 실재 관계를 다음처럼 살필 수 있다.
실재에서도 이들 관념내용은 얻을 수 없다.
관념에서도 본바탕인 실재를 얻을 수 없다.
한편 실재는 관념이 아니다.
관념도 실재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실재를 떠나 관념을 얻는 것도 아니다.
결국 관념은 관념영역에 있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그래서 명자뿐이다.
이렇게 제시한다.
이는 다음을 제시한다.
관념은 실체도 아니다
즉 참된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다.
[법무아, 승의무자성]
그래서 참된 진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관념은 본바탕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은 실다운 내용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마치 꿈이나 환영과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집착을 갖고 대하지 않아야 한다.
관념을 놓고 이런 내용을 살폈다.
그런데 <감각현실>을 놓고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음처럼 살필 수 있다.
관념에 <감각현실>은 없다.
<감각현실>에서도 관념은 얻을 수 없다.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그러나 <감각현실>은 또 일정한 관념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현실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 <감각현실> 사이에서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종류의 <감각현실>은 우선 다른 종류의 <감각현실>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색은 소리의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또 소리는 색의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그리고 한 종류의 <감각현실>은 다른 <감각현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색은 소리가 아니다.
소리도 색이 아니다.
그리고 각 <감각현실> 색ㆍ성ㆍ향ㆍ미ㆍ촉 각각의 관계가 서로 이와 같다.
그러나 각 <감각현실>은 또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모습을 볼 때 소리를 반복해 듣는다.
그래서 이들 각 내용은 동시 부대 상황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현실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각현실>과 실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실재에서 이들 <감각현실>은 얻을 수 없다.
<감각현실>에서도 본바탕인 실재는 얻을 수 없다.
실재는 <감각현실>이 아니다.
<감각현실>도 실재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실재 본바탕을 떠나 <감각현실>을 얻는 것은 아니다.
<감각현실>은 그런 실재를 바탕으로 얻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재 본바탕과 <감각현실>은 서로간에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서로 맞닿아 있다.
이를 즉(即)해 있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현실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통해 다음을 이해할 수 있다.
- <감각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한편 어떤 내용이 실다운 내용인가를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실체의 유무도 함께 문제된다.
즉, 이 경우 이들 내용이 꿈과 다른 참다운 진짜인가를 살펴야 한다. [실체의 존부문제]
그런 실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꿈과 다른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실다운 것이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꿈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그래서 실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실체의 존부가 문제된다.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내용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집착을 잘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각 내용이 '실재나 다른 영역에' 있는가를 함께 잘 살펴야 한다.
따라서 경전과 논서에서 이런 측면에서 유무논의를 행한다.
이런 경우 다음 측면의 유무 논의가 주된 초점이다.
즉 그런 내용이 '다른 영역'에 정말 있는가 이것이 초점이다.
어떤 내용이 실다운가를 판단함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무를 논의하게 된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 유무판단]
이 경우 다음 측면의 유무 논의와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각 내용이 그 자체의 각 영역에 그처럼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또는 각 내용이 그 자체의 영역에서 그처럼 얻어진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유무를 살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앞의 논의와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관념이 관념영역에 그처럼 '있다'.
<감각현실>이 <감각현실> 영역에 일정하게 '얻어진다'.
본바탕 진여 실재가 공한 상태로 '여여하게 있다'.
이런 내용도 유무판단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측면의 논의는 앞에서 살핀 유무논의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경전에서
다음을 제시한다.
생사현실에 본래 생멸과 생사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제시한다.
이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그런 A의 생멸이나 생사가 있다.
이처럼 잘못 여긴다.
이 경우 그는 생멸이나 생사가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여기며 일정부분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각 영역에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본바탕 실재 영역도 사정이 그와 같다.
그리고 어느 영역에도 이에 해당한 참된 진짜 실체는 없다.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긴다.
현실에 생멸함이 있다.
그리고 영원함이 있다.
또는 아주 없어짐도 있다.
또 무언가가 서로 같고 다름이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오고 감이 있다.
이처럼 여긴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본래 다른 영역에서 모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꿈과 현실의 관계와 성격이 같다.
위에서 그 사정을 보았다.
이는 다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념이나 <감각현실>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각 영역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따라서 그런 영역에 그런 내용은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이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 같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그래서 유무 상단 등의 논의가 행해진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떤 측면에서의 유무 논의인가를 먼저 잘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대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양한 유무판단을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다양한 유무판단
현실에서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 모습을 대하면서, 한편 관념 분별을 함께 행한다.
그래서 관념 영역에서 각 부분에 대응해 이렇게 저렇게 묶고 나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자신]
또 마찬가지로 일정부분은 영희나 철수라고 여긴다. [인간]
또 일정부분은 양 또는 개 또는 나무라고 여긴다. [유정물]
또 일정 부분은 바위나 물이라고 여긴다. [무정물]
이 경우 이들 각 부분은 모습과 특성이 다른 것으로 분별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 임한다.
그런데 경전 등에서 그런 영희나 자신은 '얻을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그 생멸도 '얻을 수 없다'고 제시한다.
오고감도 '얻을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는 이들이 어떻다고 제시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자.
현실에서, 주로 존부를 논의하게 되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를 표시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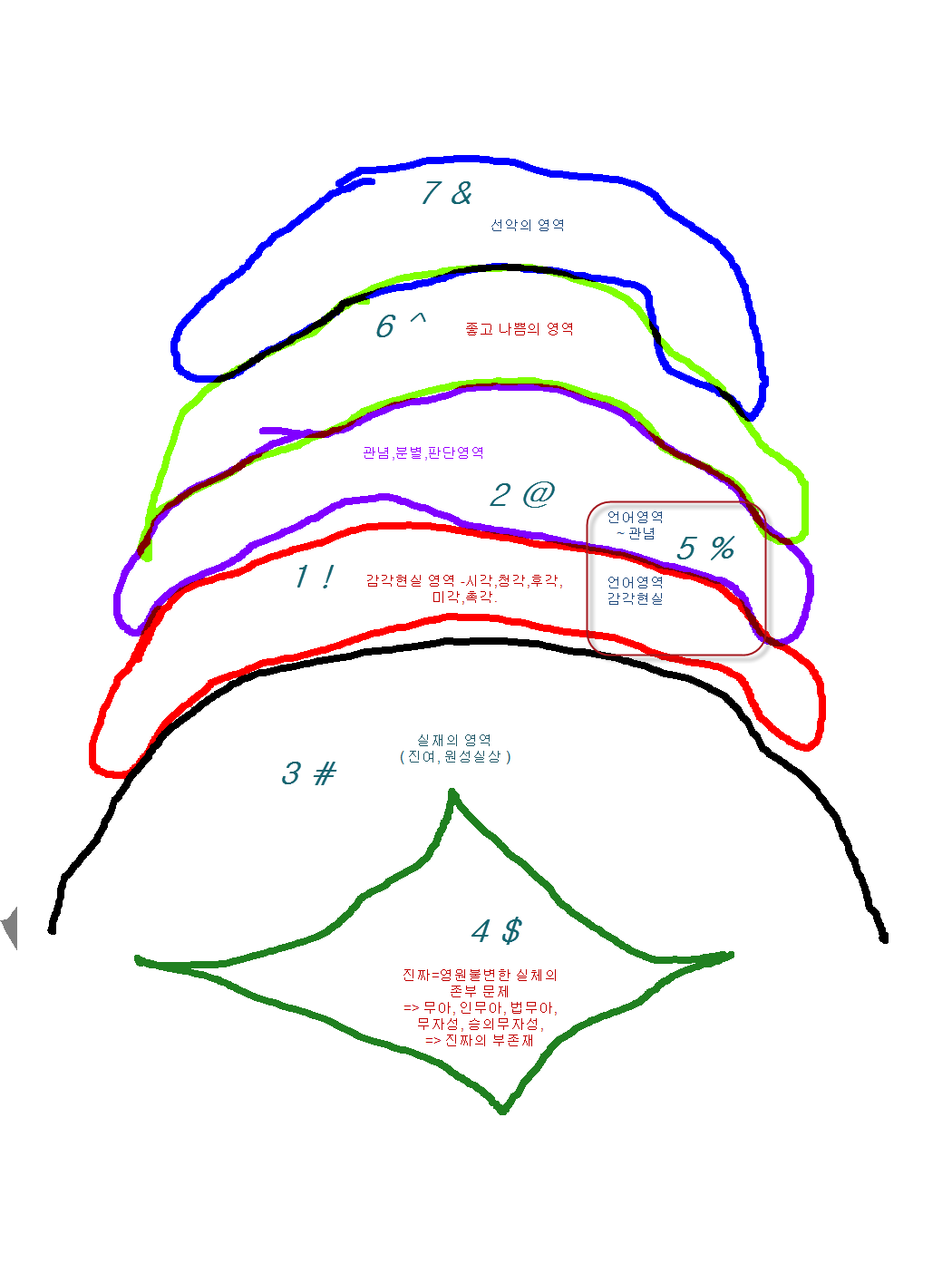
[img1]
08pfl--image/존재의_영역_설명.png
♥Table of Contents
▣- 존재가 문제되는 다양한 영역
존재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주된 영역이 있다.
이를 다음같이 나열해볼 수 있다.
우선 감각기관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는 <감각현실>[색ㆍ성ㆍ향ㆍ미ㆍ촉]!이다.
그래서 이들 <감각현실>이 먼저 문제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관념분별을 일으킨다.
따라서 관념분별@이 문제된다.
이들은 모두 현실에서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정확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한 주체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 내용이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관계하지 않고도 실재하는 본 바탕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실재#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실재 영역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또 이들 내용에 꿈과 달리,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있는가도 문제된다.
한편 이런 각 영역의 내용을 가리키기 위해 언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유무 판단을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각기 어떤 영역의 무엇을 문제 삼는가부터 잘 살펴야 한다.
이 사전에는 '바위'가 들어 있다. [언어로서의 바위]
저 산에 '바위'가 보이고 있다. [<감각현실>로서의 바위, 시각정보, 색]
'바위'는 물체에 포함된다. [관념으로서의 바위]
'바위'의 실상은 공하다. [실재로서의 바위]
참된 실체로서의 '바위'는 없다. [실체로서의 바위]
이들 각 문장에서 언어표현만으로는 각 부분의 바위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각 문장에서 같은 표현이 가리키는 영역이 크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무 논의에서 먼저 이점을 명확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잘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서로 논의의 대상에 대해 혼동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어떤 사전에 글자로서 '바위'가 있는가를 논의한다.
그런데 이를 산에 바위가 있는가 없는가의 논의로 이해한다.
그러면 서로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유무 논의를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떤 영역의 무엇을 문제 삼는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이들 논의는 주로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을 기초로 전개한다.
이 경우 정신의 각 영역과 구조를 다음처럼 표시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들 논의는 다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인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img8]
08pfl--image/8식-8.jpg
위 그림에서 각 번호는 다음을 의미한다.
1은 눈으로 얻어낸 내용을 의미한다. [시각정보, 좁은 의미의 색]
2는 귀로 얻어낸 내용을 의미한다.[청각정보, 성]
3은 코로 얻어낸 내용을 의미한다.[후각정보, 향]
4는 혀로 얻어낸 내용을 의미한다.[미각정보, 미]
5는 몸으로 얻어낸 내용을 의미한다.[촉각정보, 촉]
6은 분별로 얻어낸 관념내용을 의미한다.[관념분별, 법]
7은 제7식 내용을 의미한다.
8은 제8식 내용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어떤 것의 있음[有]'과 '없음[無], 또는 얻을 수 없음, 얻을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 경우 위에 나열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존재를 분류할 때 5위 75법, 5위 100법 등을 나열하기도 한다. [색법, 심법, 심소법, 색불상응행법, 무위법]
이들 항목이 다 이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무 판단에서 논의 초점이 되는 주된 내용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런 부분만 간단히 나열해 살펴보기로 한다.
즉 기초적인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일반적 입장에서의 유무 문제
일반 현실에서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다고 하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와 같다
안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방안을 한참 찾아 본다.
그리고 나서 다음처럼 말한다.
방안에는 안경이 없다.
그리고 식당에서 한참 찾아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당에 안경이 있다.
그리고 길을 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
길에 장미꽃이 피어 있네.
이처럼 일상에서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유무 판단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망상 분별과 관련된다.
경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다.
그래서 이 사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Table of Contents
▣- 관념에 대응하는 <감각현실> 유무문제
일반적 입장에서 유무판단을 한다고 하자.
그래서 철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식당에 안경이 있다.
그런 경우 옆에 있는 영희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안경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철수가 일정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일상에서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주로 이런 형태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유무판단는 다음 경전 입장과는 다르다.
경전에서는 두 영역의 관계에서 다음을 문제 삼게 된다.
즉 감각 현실 영역 안에 그런 관념 내용이 정말 들어 있는가. → 들어있지 않다.
또 관념 내용 안에 그런 감각 현실이 들어 있는가. →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감각 현실 일정부분이 곧 그러한 관념인가. → <이다>라고 할 수 없다. (무상삼매해탈)
반대로 그런 관념은 곧 그러한 감각 현실인가. → 아니다. (변계소집상의 상무자성)
경전에서 문제 삼는 유무 논의는 위와 같은 논의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처럼 감각현실과 관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망상 분별에 기초해서 이두 영역의 내용을 접착시켜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유무 논의에서 서로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잘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관념으로 <감각현실>을 찾아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현실에서 어떤 내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으로는 두 경우가 있다.
먼저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관념이 선행하는 경우 (관념 → 가리킴 →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 )
먼저 관념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그 뒤에 감각현실 영역에서 상응하는 내용을 찾는 경우가 있다.
현실에서 이런 순서로 유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무를 문제 삼는 어떤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어떤 생각 A를 떠올린다.
그것은 영희일 수도 있다.
또는 책일 수도 있다.
또는 안경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관념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먼저 관념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후 <감각현실>에서 그에 상응한 내용이 얻어지는 지를 찾는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철수가 공원에서 영희를 찾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관념영역에서 찾을 영희의 <몽타쥬>를 떠올린다.
이는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관념내용>이다.
그런 가운데 공원을 둘러보며 찾는다.
이 경우 눈을 떠 얻는 내용은 <감각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이 경우 아직 아무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속에 자신이 찾는 영희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영희에 대한 관념이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감각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찾는다.
즉 <영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다.
이 경우 영희라고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그런 가운데 유무 분별을 하는 경우다.
-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철수가 공원에서 그처럼 영희를 찾는다.
그러다가 <영희라고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 얻어진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부분에 영희가 그처럼 <있다>고 판단한다.
-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편 철수가 그처럼 찾는다.
그러나 <영희라고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철수는 공원에 영희가 '없다'고 판단한다.
- 망상분별과의 관계
그 상황에서 그에게 영희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철수가 손가락으로 일정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그 부분을 곧 영희로 여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영희가 공원에 '있다'고 보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자.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취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 판단은 망상 분별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을 먼저 대한 후 유무 판단하는 경우
현실에서 어떤 내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으로는 다음 경우가 있다.
- 관념이 후행하는 경우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 → 일으킴 → 관념)
현실에서 먼저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 상태에서 후발적으로 각 부분에 대응해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특정내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즉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를 □이라고 표시해보자.
-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데 그 각 부분에 대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을 대해 영희라고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그 부분에 영희가 그처럼 <있다>고 판단한다.
-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한편 각 부분을 대해 영희라는 분별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누군가 영희가 그 곳에 있는가를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하게 된다.
여기에 영희는 <없다>.
그런 영희는 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뜨고 있다.
빛도 비추고 있다.
사물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지도 않다.
그래서 무언가 <감각현실>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다른 사물은 보인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에서는 '꽃'이라는 관념분별을 자신이 일으킨다.
따라서 만일 영희가 거기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과 같은 형태로 일정한 모습이 보일 것이다
즉 영희라는 생각을 일으킬 일정한 <감각현실>이 얻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 거기에 영희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영희는 '없다'고 표현한다.
- 망상분별과의 관계
이 경우 철수가 영희가 있다고 보고한다고 하자
물론 이는 다음 현상과 기초적으로 관련된다.
즉 그 부분을 대하며 영희라는 관념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판단은 역시 망상 분별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영희가 어디 있는가라고 그에게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철수가 손가락으로 일정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그 부분을 곧 영희로 여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영희가 공원에 '있다'고 보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자.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취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 판단은 망상 분별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일반적 유무판단시 유무 양변을 모두 떠나야 한다는 입장
일반적인 유무판단을 행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 유무판단은 대부분 <잘못된 망상분별>과 관련된다.
이 사정은 무상해탈삼매 부분에서도 자세히 살핀다.
[참고 ▣- 무상삼매 ]
따라서 내용이 많이 중복된다.
그러나 현실의 유무 분별과정에서 망상분별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결국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다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 망상 분별이 발생하게 되는 기본 배경 사정
망상 분별이 발생하게 되는 기본 배경 사정부터 살펴보자.
현실에서 일정한 관념과 감각 현실은 다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한 주체는 감각 현실과 관념 분별을 동시에 함께 얻고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한순간에 두 내용을 함께 겹쳐서 얻게 된다.
또한 각 주체는 다음 경험을 반복한다.
즉 일정한 감각현실을 대할때 일정한 관념을 반복해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각 주체가 감각 현실 영역과 관념 분별 영역을 서로 관계시킨다.
즉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은 일정한 관념을 <일으킬 수 있다> .
또 일정한 <관념 >으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정한 관념과 감각 현실 부분이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자.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 → 일으킴 → 관념
관념 → 가리킴 →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
이 경우 일정한 관념은 상(想)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은 그러한 관념 [想상]에 대해 취하는 상(相)이라고 한다.
- 현실에서의 <일상적인 유무판단>과 <망상분별>과의 관련성
현실에서 철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고 하자.
방안에 안경이 있다.
물론 이는 일상적인 유무판단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감각현실과 관념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관념과 감각 현실이 접착된 상태다.
그래서 명확히 두 영역 내용을 구분하면서 판단하는 형태는 아니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무 판단은 애매하다.
그래서 <방 안에 안경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 지가 애매하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있다라고 표현할 때 잠재적으로는 망상 분별이 전제된다.
즉 주로 다음과 같은 망상분별과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어떤 이가 안경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철수는 감각현실 일정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그런데 이는 사실 철수가 다음처럼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곧 그런 관념내용'이 있다' [X]
- 예를 들어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영희가 그처럼 '있다'. [X ]
그런 경우 이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다
- 그런 <감각현실> 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다' [X]
- 즉 그런 <감각현실> 부분이 곧 자신이 생각하는 영희'이다' [X]
이처럼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평소 손가락으로 그렇게 가리킨다.
그래서 앞과 같은 전제에서 <있다>거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자.
그러면 곤란하다.
그런 경우 이들 판단은 잘못된 망상 분별이다.
결국 일상적인 유무 판단은 경전에서 행하는 판단과 어긋난다.
이런 사정으로 경전에서는 이 두 내용을 구분해서 엄격히 유무 판단을 한다.
경전에서는 이 경우 다음처럼 유무 논의를 행한다.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A을 얻을 수 없다. [O]
그래서 - 그 부분은 그런 A이다 - 라고 할 수도 없다. [O]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붙잡고 어떤 A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다.
이런 사실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으로서 유무판단>
한편 이는 다음 형태의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으로서 유무판단>과는 구별해야 된다.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으로서 유무판단>은 다음을 문제 삼는다.
언어로 어떤 내용을 설명한다.
이 때, 일정한 감각 현실 부분을 가리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다.
현실에서 어떤 관념과 다음관계를 갖는 감각현실 부분이 있다.
일정한 관념으로 → 가리키게 되는 →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
일정한 관념을 - 일으킬 -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
예를 들어 현실에서 감각을 한다.
그런 가운데 위 관계를 갖는 감각 현실 부분이 얻어지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있다 없다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입장에서 안과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앞에 사과가 보입니까?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그 가운데 파란 사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환자의 시력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고 하자.
이는 다음 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관념과 특정한 관계를 갖는> 감각 현실이 얻어지는가.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현실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를 문제 삼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언어적 가리킴으로서 유무 판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즉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의 유무 판단>은 다음을 문제 삼는다.
현실에서 방 안에서 감각을 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관념을 <일으킬 > <감각 현실 부분>이 얻어진다. [O]
즉 일정한 관념으로 <가리키게 되는> 일정한 <감각 현실 부분>이 얻어진다. [O]
→
그런데 그런 감각현실 부분을 언어로 A라고 표현해 가리킨다.
→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방에 A 가 있다.
이는 경전에서도 방편, 시설, 안립 형태로 사용한다.
이는 다음 사정 때문이다.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 현실 내용을 대상으로 논의할 때가 있다.
그런데 감각 현실은 그 상태로 다음 순간에 그대로 보관할 수도 없다.
또 다른 주체에게 직접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주체에게 대신 언어를 통해 그 내용을 <가리켜>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는 단순히 그런 부분을 <가리키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무논의는 <일상에서 행하는 유무 논의>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또 감각 현실과 관념을 접착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망상 분별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하나의 언어 표현은 여러 영역의 다양한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맥락을 통해 각 경우를 잘 구분해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결국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의 유무 판단>은 다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 즉 그런 감각 현실 부분에 그런 관념이 들어 있는가 없는가 -
이런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를 문제삼았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각 영역의 관계를 문제삼는 경전상 유무판단>이다.
그래서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의 유무 판단>은 <경전에서 문제 삼는 유무 논의>와 다르다.
따라서 혼동을 일으키면 안된다.
그리고 이는 <일상에서 행하는 유무 판단>과도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 각각을 서로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구분을 잘해야 된다.
- <경전에서 문제 삼는 유무 논의>의 초점
생사고통을 해결하려는 입장이라고 하자,
여기서는 유무 논의는 다음이 초점이 된다.
즉 그런 관념이 <감각현실> 부분에 들어 있는가 여부가 초점이다.
이처럼 유무논의의 성격이 다르다.
즉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관념내용 A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가 초점이다.
그런데 <감각현실> 영역에서는 그런 관념 내용 A는 본래 '얻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그런 A는 실답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함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정확히 살핀다고 하자.
여기서 유무를 문제 삼는 A는 관념이다.
한편 '있고 없음' 분별 자체도 관념영역 내에서 행하는 관념분별이다.
그런데 <감각현실> 영역에는 본래 관념 일체를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감각현실> 영역에서는 관념 A 의 유무 판단 자체를 본래 세울 수 없다.
그런 사정으로 <감각현실> 영역에서는 <있고 없음>의 분별을 모두 떠나야 한다.
그래서 그런 관념 A 는 <감각현실> 영역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한편,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전에서 살피는 유무 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경우 다음 사실을 제시하게 된다.
-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관념이 들어 '있지 않다' -
이런 사실을 제시하는 것 뿐이다.
한편 이런 방식의 논의는 다음처럼 실재 영역과도 관련돼서 논의된다.
즉 현실 내용이 본바탕 실제에도 그대로 있는가.
이런 논의도 그 취지는 마찬가지다.
이는 그 내용이 꿈처럼 실지 않음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유무논의가 수행에서는 중요하다.
즉 생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위 측면의 유무논의가 의미를 갖는다.
- 일반적인 입장에서의 의문
이런 경우 이 논의를 <일반적 입장의 유무 논의> 와 혼동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 의문을 갖게 된다.
분명 영희라는 관념을 일으킬만한 <감각현실>을 자신이 얻고 있다.
그런데 왜 현실에 그런 영희가 있지 않다고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각 판단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 앞에서 살핀 각기 다른 유무판단을 다시 한번 구분하여 보자
<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의 유무 판단>
- 일정한 <관념을 일으킬만한 > <감각현실>을 자신이 얻고 있다. [O]
- 예를 들어 영희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감각현실 얻는다.[O]
-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O]
- 즉 저 <감각현실> 부분이 영희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O]
(언어표현 → ) 방안에 영희가 있다. 저기 손으로 가리킨 그 부분이 영희다. [O]
현실에서의 <일상적인 유무판단>
- 그런 <감각현실 부분>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 내용>이 들어 있다 . [X]
- 예를 들어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영희가 그처럼 '있다'. [X ]
- 그런 <감각현실> 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다' [X]
- 즉 그런 <감각현실> 부분이 곧 자신이 생각하는 영희'이다' [X]
(언어표현 → ) 방안에 영희가 있다. 저기 손으로 가리킨 그 부분이 영희다.[X]
<각 영역의 관계를 문제삼는 경전상 유무판단>
- 그런 <감각현실 부분>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 [O]
- 예를 들어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영희가 그처럼 '있지 않다'. [O]
- 그런 <감각현실> 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O]
- 즉 그런 <감각현실> 부분이 곧 자신이 생각하는 영희'라고 할 수 없다. [O]
(언어표현 → )
방안에 영희를 얻을 수 없다. [O]
저기 손으로 가리킨 그 부분이 영희라고 할 수 없다. [O]
(방편적인 표현 → <있다>거나 <이다)는 망상분별을 상대가 일단 벗어 나게 하고자 하는 취지)
방안에 영희가 없다. [△]
그 부분은 영희가 아니다. [△]
이들 각기 다른 유무판단을 살펴보자.
이들은 언어상으로나 분별상으로나 혼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잘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기초적 언어적 가리킴의 유무 판단>은 옳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일상적인 유무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 현실에서의 <일상적인 유무판단>과 <망상분별>
현실에서 유무 판단을 행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에서 대부분 뒤와 같은 <일상적인 유무판단>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망상 분별이다.
-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배경사정
이런 망상 분별을 일으키는 사정이 있다.
한 주체는 감각 현실과 관념 분별을 동시에 얻고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한순간에 두 내용을 함께 겹쳐서 얻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내용 간의 관계를 반복해 경험한다.
일정 감각 현실부분 → 일으킴 → 일정 관념 [O]
일정관념 → 가리킴 → 일정 감각현실 부분 [O]
그리고 이런 반복된 현실 경험을 통해서 다음의 망상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일정 감각 현실부분 = 일정 관념 . [X]
일정관념 = 일정 감각현실 부분 . [X]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분별도 행한다.
일정 감각 현실부분 안에 → 일정 관념이 들어있다.[X]
일정관념 안에 → 일정 감각현실 부분 (自相 , 구체적 특별한 모습)이 들어있다.[X]
- 망상분별이 잘못인 사정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분별이다.
원래 감각현실과 관념은 서로 다른 영역(界)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들을 분리해 대해야 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영역의 내용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계분별관)
이는 다음 현상이다.
한 주체는 감각 현실과 관념 분별을 동시에 얻고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한순간에 두 내용을 함께 겹쳐서 얻게 된다.
그런 가운데 각 주체가 감각 현실 영역과 관념 분별 영역을 서로 접착시킨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 [界계]를 분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이가 영희가 어디에 있는가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철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이는 그가 다음처럼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 그런 <감각현실>부분이 곧 그런 영희'이다'. [X]
- 또 그런 부분에 그런 영희가 그처럼 '있다'. [X]
이처럼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평소 손가락으로 그렇게 가리킨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신이 얻은 감각 현실 가운데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영희가 '있다'고 분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망상분별이다.
- 망상 분별의 잘못을 이해하는 효과
위 내용을 통해 다음을 이해해야 된다.
- 감각현실과 관념 각 영역의 내용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 -
그래서 각 영역의 내용에 대해 집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잘못된 망상 분별과 집착에 기초해서 업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 고통을 예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망집에 기초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선 경전에서 다음처럼 말하게 된다.
이 상황에 그 (감각현실)부분에 영희(관념)는 '<얻을 수 없다>,
→ 그 (감각현실)부분에 영희(관념)는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 (감각현실)부분에 영희(관념)는 <없다>
이런식으로 표현해 제시한다.
물론 엄격히 볼 때 다음 두 표현의 의미는 다르다.
<얻을 수 없다> - <없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얻을 수 없다>는 유무 분별을 모두 떠난다.
그래서 <있고 없음의 분별>을 모두 떠나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영희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방편상 그처럼 통상 말하게 된다.
그런데 경전 등에서 이처럼 방편상 표현하는 사정이 있다.
- 방편상 사용하는 표현과 오해 문제
<얻을 수 없음>는 본래 이런 유무 등의 2분법상의 분별을 모두 떠난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장은 통상 <유무 2분법상의 분별>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도 통상 < 2분법 분별을 모두 떠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대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2분법상의 표현 >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려는 취지로 '<없다>'라고 표현한다.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이 방편상 표현하는 것이다.
얻을 수 없다
→ 있다고 할 수 없다
→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방편상 )→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또 다음 사정이 있다.
이는 일단 '있다'는 판단을 떠나게 하려는 취지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집착을 우선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현실에서 일반적으로는 '있다'고 여기는 내용에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있음>의 판단에 기초해 업을 행한다.
그래서 '있음'의 분별과 그로 인한 집착의 폐해가 훨씬 크다.
그런 사정으로 방편상 <없다> 라는 표현을 일단 사용한다.
그래서 경전에서 다음처럼 제시한다고 하자.
- 그런 영희가 없다.
그것은 결국 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정한 감각 현실부분 안에 - 일정한 (영희라는)의 관념은 <얻지 못한다>
[O] <→ 들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있지 않다>. < → 없다 >
일정한 (영희라는) 관념에는 - 일정 감각현실 부분 (自相 , 구체적특별한 모습)이 <들어있지 않다> [O]
일정한 감각 현실부분은 → 일정한 (영희라는) 관념 <이다고 할 수 없다> [O] → <아니다>
일정한 (영희라는) 관념은 → 일정 감각현실 부분이 <아니다>. [O]
그래서 이들 각 내용을 서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형식의 유무 논의는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본바탕 실재 영역과 관련해서도 이는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된다.
그래서 현실 안 내용들에서부터 먼저 기초적으로 잘 구분해야 된다.
- 다시 구분해야 하는 별개의 유무 판단 -
한편 경전에서 유무 논의에서 다음 논의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성격의 논의와 잘 구분해야 된다.
즉 이는 이 상황에서 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러그러한 '<감각현실>'을 얻지 못한다.[X]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런 분별을 일으키지 못한다.[X]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그러그러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O]
그리고 그 <감각현실> 가운데 일정부분을 대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관념' 분별(예: 영희)을 일으킨다. [O]
그래서 그러그러한 '관념'을 얻는다. [O]
또 일정한 관념으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킬 수 있다. [O]
또 이런 취지로 현실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 [O]
이는 경전에서 사용하는 방편 시설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기초적으로 다음 내용도 논의된다.
유무 논의에서는 기초적으로 이들 논의부터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잘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감각현실 자체를 얻는가의 문제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런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즉,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사실 자체는 통상 유무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
<감각현실>을 얻는 조건 상황에서 <감각현실>을 얻는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통상 이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관념 자체의 존부문제
처음에 공원에서 영희를 찾아 나선다.
이 상황에서 눈을 감는다.
그런 경우에도 영희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관념내용이다.
즉, 영희라는 관념내용이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관념영역에는 그런 일정한 관념이 있다.
즉 어떤 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이상, 일정한 관념은 관념영역에 있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는 통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 토끼에게 뿔은 없다.
그렇지만, 토끼의 뿔의 존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 경우 그런 토끼뿔의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그런 관념은 일단 관념영역에서는 얻어진다. → 있다.
그런데 이는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들은 유무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여러 형태의 유무 논의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망상분별 부분이 논의핵심이 되는 사정
경전과 논서에서 유무판단을 행한다.
이런 경우 주로 다음이 초점이다.
우선 본바탕 영역에 A라는 내용이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또한 현실에서도 다음이 문제된다.
즉 <감각현실> 부분에 일정한 관념 A라는 내용이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반대로 일정한 관념 A안에 <감각현실>이 '있는가' 도 함께 문제 삼는다.
경전에서 문제삼는 유무논의는 이런 내용이다.
여기서 본바탕 실재 영역과 관련한 유무논의는 공삼매와 관련된다.
그리고 감각현실 및 관념과 관련한 유무논의는 무상삼매와 관련된다.
[참고 ▣- 무상삼매 ]
그런데 이런 내용이 논의의 초점이 되는 데에는 사정이 있다.
우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또 다음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판단은 생사고통 문제와 큰 관련이 있다.
만일 이 문제가 생사고통 문제 해결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는 단지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한 논의에 그친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않다.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수행의 1차 목표다.
이 경우 문제되는 생사 현실과 고통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정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해결방안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만일 현실 문제내용이 꿈과 완전히 성격이 같다고 하자.
그러면 문제 해결방안이 달라진다.
그러나 또 현실이 꿈과 반대로 완전히 다르다고 하자
그러면 또 그 경우 해결 방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또 그 성격이 양쪽에 걸쳐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 경우도 또 해결방안이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내용의 정체와 성격파악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문제되는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처럼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그 내용의 정체파악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 현실 내용의 정체 파악
수행자가 처음 파악할 내용은 다음이다
꿈은 실답지 않다.
그런데 꿈이 갖는 특성을 a,b,c 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
A. 꿈은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만 <임시적>으로 얻는 내용일 뿐이다. [임시성]
즉 그런 <조건과 상황>을 떠나면 얻을 수 없다. [조건의존성]
B. 한편, 꿈 내용은 정작 꿈을 꾼 침대에서는 얻을 수 없다.
즉 꿈 내용을 얻는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C. 한편 평소 일정한 내용은 일정한 여러 <성품>을 갖는다고 여긴다.
그런데 꿈 내용은 <그런 성품>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꿈에서 본 바위는 현실의 바위와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가짜성품]
예를 들어 바위는 단단하다. 무겁다.
이런 등의 여러 성품을 갖는다고 여긴다.
그런데 꿈 내용은 <그런 성품>을 갖지 못한다.
즉 단단하지도 않다. 그리고 무겁지도 않다.
즉 그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성품>들을 얻지도 못한다.
----
A. [임시성][조건의존성]
B.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C. [가짜성품]
이제 어떤 것이 abc라는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꿈과 같다고 할 수 없다.
- 실체
한편 이런 경우가 있다.
단순히 abc 특성을 갖지 않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정반대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abc와 각기 정반대되는 특성을 다시 xyz라고 표시해 보자.
그래서어떤 내용이 x.y. z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꿈과는 아주 정반대의 특성을 갖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는 꿈과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정반대다.
이런 경우는 다음처럼 표현하게 된다.
- 그것이 참다운 실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음처럼 먼저 검토해 보자
흰색이 있다.
그런데 흰색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들 색들은 모두 흰색이 아닌 색들이다.(모순개념)
그런데 이 경우 일단 흰색의 정반대는 검정색이라고 말하게 된다 (반대개념)
그런데 다시 범위를 넓히면 소리, 향기, 맛, 촉감도 나열할 수 있다.
이는 다음 문제와 관련된다.
소리가 흰색인가.
흰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노란색인가.
노란색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소리, 향기, 맛, 촉감등은 아예 그 범주가 다르다.
그래서 이는 계(界- 영역)가 다르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여하튼 현실에서 이들 관계가 문제는 된다
그리고 현실의 특성을 살필 때도 이런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현실의 정체와 성격을 살핀다고 하자.
그래서 먼저 꿈이 갖는 특성을 abc라고 하자.
그리고 꿈과 정반대의 특성을 갖는 실체적 특성을 xyz 라고 하자.
----
x.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 변화하지 않아야한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늘 존재한다.
그래서 <영원불변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영원불변성, 항상성] - [ a: 조건의존성 X, 임시성 X]
y. 또한 이는 어떤 영역에서도 함께 파악된다.
즉 어떤 영역에서도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
[고정성, 실질적 뼈대 ]-- [b: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X ]
z. 요구되는 참된 성품을 갖는다.
즉 그 자신의 참된 독자적 자체의 성품[자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자신을 다른 것과 구분하게 하는 <영원불변한 성품>[자성]을 가져야 한다.
[ 참된 성품(자성) ] - [ C: 거짓 성품 X]
----
x. [영원불변성, 항상성]
y. [고정성, 실질적 뼈대 ]
z. [ 참된 성품(자성) ]
그래서 <실체>는 조건에 관계 없이 영원 불변하며 [x] ,
어떤 것의 뼈대를 이루어 고정되고 [y],
<참된 진짜의 내용> [Z]을 뜻한다.
한편 현실이 꿈과 달리 갖는 특성을 defg이라고 표시하자.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다.
----
D 감각 현실은 대단히 감관별로 다양하고 생생하게 매 순간 얻는다.
또 이에 기초해 명료하게 분별한다.
[ 다양 생생 명료함]
E 그리고 감각현실 각 부분 특성이 달리 파악된다.
그래서 자신 - 인간 - 다른 생명체 - 무정물 부분의 특성이 다르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을 경험한다.
하나에 감각 현실 각 부분이 서로 다른 특질을 갖는다.
즉 자신의 몸부분 - 자신과 동류인 사람 - 다른 생명(강아지, 고양이, 나무) - 무생물체 부분들이다.
이들 각 부분은 한 주체가 눈을 뜰 때 다 함께 감각 현실로 얻는다.
그럼에도 이들 각 부분은 생활상 각기 다른 특성이 파악된다.
그래서 다음처럼 추리하게 된다.
- 그런 특성을 갖게 하는 다른 실다운 내용이 본 바탕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리하게 된다.
[→ 자신(신견), 인간, 생명,무생물 구분]
F 또한 현실은 <다수 주체>가 함께 <일정시기> <일정상황>에서 <일정한 내용>을 <일정조건>에서< 반복>해 얻어 나간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물리나 화학법칙이 적용된다고 이해된다.
[ 4난- 다수 주체, 시기, 상황, 법칙성]
G 그리고 현실은 단지 각성만으로 깨어나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
[ 구속성]
----
결국 현실의 다음 DEFG 특성은 꿈이 같지 않는 대표적 특성이다.
D [ 다양 생생 명료함]
E [ 자신(신견), 인간, 생명,무생물 구분]
F [ 4난- 다수 주체, 시기, 상황, 법칙성]
G [ 구속성]
한편 현실 생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의 생사 고통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일 현실 생사 고통이 완전히 꿈과 같다고 하자.
그러면 문제 해결 방안이 훨씬 쉽게 된다.
꿈을 깨는 것만으로 꿈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현실이 꿈과 정반대인 특성 xyz를 갖는다고 하자.
그래서 실체적 내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완전히 꿈과 다르다.
이 경우는 또 문제 해결 방안을 달리 취해야 된다.
그러나 또 현실이 그렇지는 않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은 어중간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각 특성을 고려해서 생사 현실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처럼 각 경우마다 생사 현실내 고통의 해결 방안이 달라진다
따라서 생사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병을 치료하려는 입장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해결하는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된다
이 경우 꿈이 갖는 특성 가운데 다음 측면이 있다.
꿈의 내용은 그 꿈 밖 영역에서 그 내용을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이가 꿈에서 바다나 황금 꿈을 꾸었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내용은 그가 누워서 자는 침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대로 얻어지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은 꿈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실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자신이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 내용이 감각 현실 영역에서도 얻어지는가.
또 그 내용이 본바탕이 실재 영역에서도 얻어지는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 내용에 따라 관념적 내용이 꿈처럼 실답지 않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감각 현실의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같은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사정으로 이런 측면의 유무 판단이 경전에서 중시된다.
- 현실에서 수행의 필요성
현실의 본 사정이 다음과 같다.
꿈이 갖는 특성이 abc 라고 하자.
그리고 현실이 꿈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xyz라고 하자.
그런 가운데 현실의 특성을 살핀다고 하자.
한편 현실과 본바탕의 관계를 살펴보자.
1 그런 경우 본바탕 실재에서는 어떤 성품도 얻지 못한다. (불가득 공)
즉 본바탕 실재 영역에서 그런 현실 내용을 얻을 수 없다.
한편 현실 안 내용인 (감각 현실 >과 <관념>의 관계를 서로 살펴보자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관념내용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관념> 부분에 그런 감각현실 내용은 '없다'.
또 이는 각기 다른 감각 현실들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색은 귀로 듣는 소리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또한 소리도 눈으로 보는 색의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2 한편 현실은 각 기관이 관계하는 조건에서만 얻는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는 내용은 눈을 뜰 때만 얻는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얻지 못한다.
3 한편 현실은 그에 기대하는 참된 상품을 갖는 것이 또 아니다.
즉 현실이 꿈과 완전히 다른 xyz의 실체적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무아. 무자성, 승의무자성)
이런 특성은 결국 꿈이 갖는 특성 abc와 같은 측면이다.
침대에서 꾸는 바다나 황금 꿈도 위와 같은 특성인 것이다.
또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꿈을 실답지 않다고 한다.
결국 현실은 꿈이 갖는 특성 abc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고 꿈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꿈과 다르다.
그래서 현실은 꿈과 달리 현실만이 갖는 특성 defg도 갖는다.
그래서 현실의 이런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생사 현실 내 고통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다.
현실은 꿈과 다른 특성 defg을 갖는다.
현실은 꿈과 같은 특성 abc도 갖는다.
그런데 이는 본바탕과 현실을 대조해서 판단할 때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관계로 일반적으로 현실이 꿈과 같다는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의 입장에서는 정작 위와 같이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로지 현실이 꿈과 다른 특성 defg만 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런 특성에기초해서 현실에 매몰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망집의 특성이다.
또한 그 가운데 망집이 심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도 행한다.
즉 현실에서 다음처럼 잘못된 유무판단을 행한다.
현실에서 갖는 defg 특성은 본바탕 실재 영역에도 그대로 있다.
또는 현실은 꿈과 완전히 달리 xyz와 같은 실체적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현실은 꿈과 달리 대단히 실답다.
이렇게 여긴다.
이처럼 좀 더 잘못이 심화된 망상분별을 일으켜 임한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을 갖고 임한다.
물론 위 경우 일정한 판단 자체가 곧 생사고통 문제는 아니다.
즉, 현실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다'고 잘못 여긴다.
어떤 이가 어떤 내용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곧 생사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히 문제가 그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판단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어나간다.
생사고통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일정한 분별을 행한다.
이 경우, 일단 처음 판단 자체가 잘못이다.
즉 그런 경우 그에 바탕해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런 경우 이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는 상황에 묶인다.
그리고 그런 망집을 바탕으로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받아나간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잘못된 판단이 생사고통 문제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이런 판단과 생사고통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인과로 묶여 있다.
그런 경우 그 망집으로 인해 생사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망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행하는 잘못된 유무판단을 먼저 시정해야 한다.
- 생사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의 유무판단의 중요성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잘못된 유무 분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행한 유무분별의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부분이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즉 그런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른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유무분별은 옳지 않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잘못 판단한다.
그래서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생사고통을 해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음의 잘못된 판단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된다.
다만 현실에서 이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 기초수행~인천교
잘못된 망상분별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된다.
다만 현실에서 이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본 망상분별의 뿌리가 깊다.
즉 생을 출발하기 전에 일으킨 태생적 번뇌가 있다. .- [구생기번뇌]
그리고 태어난 이후 일으키는 망상 분별은 이에 기초한다. -[분별기번뇌]
그래서 현실에서 지적 번뇌(견혹)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생을 유지하는 한 잠재적 정신에서 일으킨 태생적 번뇌는 유지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감각과 생리적 기능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형태로 유지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이런 감각과 생리적 기능에 기초해 영위하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이에 기초한 정서적 의지적 번뇌(수혹)가 남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에 기초해 일으키는 후발적 망상 분별의 제거 또한 쉽지 않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근본 망상 분별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게 된다.
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평소 자신의 손발로 여기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자신의 손발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신견(身見)이다.
그래서 망집 분별이다.
그러나 그 사정을 깨달아 이해한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그 부분에 바늘을 꼽는다고 하자.
그러면 여전히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 자신이 어디론가 움직이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부분만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이는 태어나기 이전에 일으킨 망집에 기초해 현실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그런 분별이 잘못임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해하더라도 욕계 현실에서 삶을 유지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전의 망집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즉 욕계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형태로 유무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별을 기초로 생활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생사고통을 반복해 받아나간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묶이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현실에서는 쉬운 차선책부터 먼저 사용하게 된다.
이 상황은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철부지 아이가 무조건 야구공을 바라보며 차도로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 경우 그 아이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곤란하다.
또 이해해도 여전히 그 정서적 의지적 충동을 억제시키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뒤로 미룬다.
그리고 우선 당장 차도로 뛰어들지 않게 할 방편을 먼저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망상분별 부분은 그대로 두게 된다.
즉, 처음 분별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분별을 그대로 둔다.
그래서 그런 망상 분별을 일단 그대로 전제한 상태로 임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행하는 유무분별이 옳다고 하자.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 정말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생사고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경우는 오로지 생사 고통을 예방하는 노력만이 유효하다.
그가 생각하는 내용이 실답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생사 고통을 받게 하는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보시 계 10선법 등을 통해 하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실에서 가장 기초로 행하는 다음 수행방안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일단 생사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다음 방편을 취한다.
즉 다양한 방편으로 생사고통을 받게하는 업을 우선 중단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일단 믿음에 바탕해 10선업을 행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계를 지킨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업을 중단한다.
처음 일상에서 유무 분별을 행한다.
그래서 이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서 생사고통 문제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처음 유무분별이 옳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경우 생사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제시한 이들 기초적 수행방편만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사정으로 처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선 당장의 생사고통 예방노력을 하게 된다.
- 예비적 수행단계
한편, 일단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런데 망상분별과 집착이 업을 중단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다양한 방편으로 그런 집착을 제거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가르침이 제시된다.
즉 현실에서 집착을 갖게 되는 일정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다음 판단을 하게 한다.
그런 내용은 더럽다. [부정]
=> 집착을 가질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다. [고]
=> 집착을 가질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다. [무상]
=> 집착을 가질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들은 참된 진짜가 아니다. [무아]
=> 집착을 가질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통해 집착을 벗어나도록 이끈다.
그러면 또 일정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로 인해 업도 쉽게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일단 생사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런데 이는 처음 망집을 그대로 전제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다.
즉 처음 망상분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다.
다만 앞에 처음 단계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대한 판단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망집을 제거하는 판단은 아니다.
단지 집착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세속적 판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는 임시적이고 기초적 예비수행 방안에 해당한다.
- 본 수행 -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 해탈을 구함
기초적 수행이 잘 성취되었다고 하자.
그래서 생사고통에서 어느 정도 멀어진다.
그런 경우 이제 생사의 묶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본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본 수행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망집 번뇌를 제거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망집 제거를 꾀하게 된다.
이 경우는 이전 단계와 다르다.
처음에는 집착과 업을 제거함에 치중한다.
즉 망상분별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쉽게 곧바로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망상분별 판단이 옳던 그르던 일단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런 망상 분별이 일단 옳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후 단계인 - 집착-업- 부분을 차단한 방안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생사고통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보시와 계를 계속 잘 닦는다.
그러면 업의 장애가 제거된다.
그리고 복덕자량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이후 그런 상태에서 정(삼매)와 혜를 함께 닦을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정과 혜를 닦아나간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량을 갖춘다.
그래서 망상분별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낸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 원인이 되는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래서 처음 유무 분별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잘 살핀다.
그런 경우 처음 분별이 옳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한 번뇌 등을 잘 제거한다.
그래서 일정한 잘못된 분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유무판단에서 일으키는 온갖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즉 유(有)ㆍ무(無), 상(常)ㆍ단(斷) , 생(生)ㆍ멸(滅) 등의 망집이 있다.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망집번뇌도 제거한다.
그래서 수행도 이런 단계로 밟아 나가게 된다.
이후 또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들이 이어진다.
다만 이런 본 수행은 일반 입장과 대단히 거리가 멀다.
즉 일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곧바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반 입장에서는 망상분별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망집에 깊게 묶여 있다.
그리고 욕계내 일체의 일상생활이 이런 망집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욕계에서 삶을 유지하는 한, 이 부분의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
여하튼 그런 사정으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그것이 생사 윤회에 묶이게 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 가운데 욕계에서 3악도에서 생사 고통을 받아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단계별로 꾸준하고 깊은 수행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결국 기초적으로 다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즉 일반적으로 행하는 유무분별이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기도 하다.
이 내용을 아래에 이어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일반적인 유무판단과 망상분별
현실에서 방에 영희가 있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데 이는 현실에서 일으키는 망상분별이 된다.
그리고 이는 무상상매해탈 부분과 관련이 깊다.
[참고 ▣- 무상삼매 ]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철수가 다음처럼 여긴다고 하자.
방안에 영희가 있다
그 상황에서 영희가 어디 있는가라고 그에게 묻는다.
그러면 철수가 손가락으로 일정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그가 다음처럼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감각현실>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다' [X]
그런 <감각현실>부분에 그런 관념내용'이 있다' [X]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그 부분은 영희이다. [X]
또 그런 부분에 그런 영희가 그처럼 '있다' [X]
이처럼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평소 손가락으로 그렇게 가리킨다.
♥Table of Contents
▣-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현실에서 망상분별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일으키게 된다.
- 감각현실과 관념의 병존 관계
현실에서 한 주체는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색성향미촉]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시각 <감각현실>]
그래서 그런 <감각현실>을 대한다.
그런 가운데 다시 일정한 생각[想 Saṃjña]을 '일으킨다',
이 경우 다시 그는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일정부분을 묶고 나눈다.
그래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상相]을 취한다.
<감각현실 일정 부분[상相]을 취함>과 <그에 상응하여 관념[想]을 일으킴>의 선후는 각 경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
1 관념을 먼저 일으키고 → 그에 상응하는 감각현실 일정부분[상相]을 찾아 취하는 경우.
2 일정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 그에 대한 관념을 일으키는 경우
여하튼 그런 경우 그런 <감각현실> 부분[상相]과 그런 관념[想]을 서로 '대응시켜' 임한다.
그래서 <감각현실> 일정 부분[상相]을 대해 일정한 관념을 대응시킨다.
- 관념을 일으킴의 관계
이런 경우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이 그런 관념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관념을 같은 형태로 반복해 일으킨다.
이는 그가 다른 부분을 대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을 대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희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대한다.
이 때는 영희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감각현실>과 관념이 서로 완전히 무관한 관계는 아니다.
- 관념이 가리킴의 관계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 쌓인다.
그러면 이후 그런 생각[想]은 반대로 작용한다.
즉, 그런 생각은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 일정부분 >[상相]을 취해 '가리키게' 될 수 있다.
- 관념과 감각현실의 상호관계
그래서 이들은 현실에서 상호간에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감각현실 일정부분>[상相] => (일으킴) => 관념[想]
관념[想] => (가리킴) => <감각현실 일정부분> [상相]
그리고 엄밀히 이 부분까지는 망상분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정 영역의 일정한 내용이 다른 영역의 일정한 다른 내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그런 사정으로 그런 일정 영역의 내용으로 다른 영역의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 망상분별
한편, 이처럼 한 주체는 5종류 <감각현실>과 <관념 >을 함께 얻을 수 있다. [5구의식]
또 그런 경우 <감각현실 일정 부분>과 <일정한 관념 >을 서로 '대응시켜' 임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현실 일정 부분>[상相]을 대해 <일정한 관념 >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일정한 관념 >을 기초로 <감각현실 일정 부분>[상相]을 찾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 경우 그 부분[相]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부분[相]에 그가 일으킨 관념분별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잘못 여긴다.
즉 관념을 기준으로 <감각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별한다.
이 경우 일정한 관념[想]을 바탕으로 <감각현실>을 대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판단한다.
- <감각현실>의 일정 부분[상相]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X]
그리고 그런 판단을 전제로 그렇게 일정부분을 마치 오려내듯 잘라 취한다.
이는 일정 부분을 단순히 가리키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를 상[相]을 '취한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위 상태는 처음 상태와 다르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전제로 현실에 임한다.
그러면 그런 상[相]에 '머문다'라고도 표현한다.
또 이런 판단을 전제로 소원을 일으키고 업을 행한다.
그러면 그런 상[相]을 '행한다'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모두 앞과 같은 망상분별을 전제로 임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를 이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 내용을 얻는다.
이처럼 처음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이것이 문제는 아니다.
또 <감각현실>을 얻고 난 후 어떤 느낌을 얻는다.
이것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관념을 일으켜 얻는다.
이것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감각현실>의 일정 부분을 대해 영희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도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 그런 <감각현실>도 얻는다.
그리고 그런 관념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자체는 각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념으로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역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상태에만 있다고 하자.
이런 상태는 망상분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감각현실>과 관념분별은 마음 안에 함께 병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
그런 경우 대부분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감각현실>과 관념은 <망상분별의 재료>가 되어 준다.
즉, 이를 재료로 관념영역에서 다음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그런 일정한 <감각현실의 일정 부분 >[相]이 곧 영희'이다' [X]
반대로 다른 부분은 또 그런 영희가 '아니다' [X]
또 <그 부분>[相]에는 그런 영희가 '있다' [X]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그런 영희가 '없다'[X]
이처럼 잘못 여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서 영희는 관념적 내용[想 Saṃjña]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일정한 관념[想 Saṃjña]을 바탕으로 <감각현실>을 대한다.
그런 가운데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감각현실의 일정 부분 >이 곧 그런 내용[想 Saṃjña]'이다' [X]
즉 그런 일정부분이 곧 영희'이다' [X]
그런 가운데 그런 일정부분에서 상[相]을 취한다.
처음에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었다.
그래서 <감각현실>도 얻는다.
일정한 관념을 단순히 일으켜 얻는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상태는 앞처럼 상[相]을 취한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경우는 얻어낸 감각내용과 관념을 재료로 추가로 망상분별을 일으킨 상태다.
즉 이들을 재료로 <감각내용 일부분 >을 오려 취한다.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을 일정한 관념과 <결합 >시킨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두 내용을 서로 <접착 >시킨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에게 영희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일정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이는 그가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 그런 <감각현실 일정부분>[相]이 곧 영희'이다' [X]
- 또 그 부분에는 그런 영희가 '있다' [X]
이처럼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이처럼 그가 가리킨 부분을 놓고 살펴보자.
일정한 관념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그가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즉, 일정한 관념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일정 부분을 오려 취한다.
그런데 그 부분[相]의 정체는 <감각현실>이다.
한편 그런 부분을 대해 그가 일정한 생각 A를 일으킨다.
그 경우 그런 생각 A는 관념내용[想 Saṃjña]이다.
그리고 이 경우 '있다' '없다'는 분별 자체도 관념내용[想 Saṃjña]이다.
그런데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또 반대로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또한 관념에 <감각현실>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감각현실>에 그런 관념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즉, 그처럼 취한 부분[相]에 그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想 Saṃjña]이 본래 없다.
<감각현실> 영역에서는 본래 관념내용은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감각현실> 영역에서는 어떤 관념의 유무도 분별할 수 없다.
즉, 그가 취한 부분[相]은 본래 그런 관념 내용[想 Saṃjña]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런 부분[相]에는 그런 관념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반대로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 그런 부분[相]이 일정한 관념 내용'이다'라고 잘못 여긴다.
그러므로 이런 분별을 망상분별이라고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망상분별 환자가 있다.
그가 칫솔을 대해 자꾸 개라고 여긴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개라고 여기지 않는다.
유독 칫솔을 대할 때마다 개로 여기고 대한다.
이런 경우라고 하자.
그러면 의사는 이런 환자를 망상환자라고 하게 된다.
그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가 개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그런 개가 없다.
그런데 그처럼 개가 없는 부분을 대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상황과 일반인의 상황이 성격이 같다.
다만 현실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대다수가 함께 그러하다.
그런 점만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일정 부분을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대부분 엇비슷한 분별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을 대한다.
그러면 대부분 바위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한편 현실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망상환자가 있다.
이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일반인 대부분은 칫솔 부분을 대할 때 개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망상환자만 그렇게 임한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인 대부분이 행하는 분별도 그 실질은 마찬가지다.
즉, 망상분별환자의 분별과 성격이 같다.
어떤 A라는 내용으로부터 어떤 B라는 내용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A라는 내용이 B는 아니다.
또 A라는 내용에 B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연필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후 이로부터 기차를 떠올린다.
이 경우 <연필이란 생각>이 <기차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다음의 판단은 잘못이다.
- <연필이란 생각>에 기차가 들어 있다. [X]
- 연필이 기차다.[X]
그런데 <감각현실>과 <관념분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을 대한다.
그런 상태에서 일정한 관념분별을 <일으킨다>.
이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감각현실>을 대해서 일정한 관념을 일으킬 수 있다.
사정이 그렇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 <감각현실> 안에 그런 관념이 들어 있다. [X]
- 그런 <감각현실 일정부분>[相]이 곧 그런 관념'이다' [X]
이런 판단은 잘못이다,
<감각현실> 영역은 본래 그런 관념내용 일체를 본래 '얻을 수 없다'.
<감각현실>에서 관념 내용은 얻어낼 수 없다.
단지 <감각현실>을 대해 일정한 관념내용을 <일으킨 것> 뿐이다.
이 두 내용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더욱이 다음판단도 잘못이다.
- 그런 <감각현실 일정부분>[相]이 곧 그런 관념'이다' [X]
즉 그 <감각현실>이 그런 관념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것'이다'라고 잘못 여긴다.
또 그런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이는 망상분별의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모습을 얻는다.
그리고 일정부분을 대해 꽃이란 관념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상황에 꽃 외에 다양한 관념을 일으켜 가질 수 있다.
관념은 다양한 종류의 관념을 나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 식물, 물질, 풍경, 존재, 여인, 소년, 포크...등이다.
이들을 놓고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여러 꽃을 다 묶어 '식물'이라는 관념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물질'이라는 관념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전체 부분을 보고 '풍경' 또는 '존재'라는 관념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시인은 꽃에서 여인이나 소년을 연상해낼 수 있다.
사정이 그렇다고 꽃에 그런 여인, 소년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망상증 환자가 있다.
그런 경우 그 모습을 대해 엉뚱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꽃모습을 보고 포크를 연상해낼 수도 있다.
사정이 그렇다고 그런 꽃 부분에 그런 포크가 들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대부분 그 상황에서 일정부분을 대해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사정이 그렇다고 그 부분에 꽃이 들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감각현실>과 관념의 기본관계는 이 모든 경우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있고 없음이나,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관념 >을 놓고 생각해보자.
또는 생겨남이나 멸함과 같은 <복합 관념 >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감각현실>을 대한다.
그런 경우 그런 <추상관념 >이나 <복합 관념>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감각현실>에서 그런 관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겨남이란, 없음과 있음을 묶은 복합 관념이다.
생겨남이란 즉 <'없다가 있음'>을 의미한다.
멸함은 그 반대다.
<'있다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한 순간에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감각현실>에는 '있음' 과 '없음'을 함께 얻을 수는 없다.
<감각현실>에 그 생멸 생사의 관념내용은 본래 얻을 수 없다.
꽃이 없다가 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내용을 같이 한 화면에 찍어 놓을 수 있다.
그래도 역시 같은 문제가 있다.
<감각현실>엔 관념과 같은 내용은 본래 얻을 수 없다.
다만 그런 <감각현실>을 대해 그런 관념을 일으켰을 뿐이다.
만일 <감각현실> 안에 그런 관념이 본래 들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다음처럼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대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꽃이라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데 자신이 평소 꽃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
관념은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경우 그 <감각현실>에서 그런 관념을 다시 또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데 꽃과 같은 구체적 관념이나 고유명사에서는 혼동을 가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꽃을 보고서 꽃이란 생각을 동시에 일으켜 얻는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의 관계를 혼동하기 쉽다.
이 경우 다음처럼 잘못 여기기 쉽다.
- 원래 그 <감각현실> 안에 본래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었다. [X]
-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X]
이렇게 잘못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이런 경우 이 관계를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 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념을 갖는다.
한편 관념영역에서 <감각현실>을 대해 일정부분을 묶고 나눈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이가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정작 그 <감각현실> 부분이 그처럼 묶이거나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어떤 <감각현실>을 얻는다.
이런 경우에도 그 <감각현실>이 일정 부분마다 묶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각 부분이 묶이고 나뉘면서 <전체 감각현실 >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현실 일정 부분을 묶고 나눈다고 하자.
이러한 것은 <관념 영역> 안의 문제다.
즉, <감각현실> 영역에서의 일이 아니다.
관념 작용에서 일으키는 이런 작용이 있다.
이를 변계소집(遍計所執)이라고 표현한다.
즉, 두루두루 헤아려 집착을 갖는 작용[변계소집遍計所執]이다.
어떤 이가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 바탕에서 다시 <꽃이란 관념 >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이처럼 여기기 쉽다.
이 <감각현실>과 이 관념은 무언가 서로 엇비슷하다.
<감각현실>과 관념은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여긴다.
일정한 <감각현실>을 대해 관념을 일으킨다.
이 상황은 마치 다음과 같다.
즉 - 노끈을 놓고 뱀이다 - 라고 여기는 경우와 같다.
그렇지만, 정작 뱀[관념내용]은 노끈[<감각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당정현상(當情現相) 또는 중간존경(中間存境)]
그래서 <감각현실>과 관념은 이런 관계에 있다.
이런 사정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감각현실>에는 그런 관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일정한 <감각현실>에 일정한 관념내용이 들어 있다 - [X]
그리고 일반적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그런 망상분별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분별이 잘못이라는 인식을 거의 갖지 못한다.
여기에는 일정한 배경사정이 있다.
이하에서 각 영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구분해 보자.
본바탕 실재를 #로 표시한다.
그리고 <감각현실>을 ○로 표시한다.
그리고 관념을 ■이라고 표시하기로 하자.
이경우 이들 각 영역의 관계를 다음처럼 제시할 수 있다.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그리고 <감각현실>○에 관념■이 들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현실에서 본바탕 실재#를 바탕으로 <감각현실>○과 관념■을 얻는다.
그런데 일정한 <감각현실>○과 관념■을 동시에 자주 얻는다.
그리고 이들 내용이 마음에 같이 머물게 된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런 사정으로 이 둘을 접착시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감각현실>○이 곧 관념■이다. [X]
또 <감각현실>○에 관념■이 들어 있다. [X]
이런 판단들이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그런데 그런 망상을 일으킨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둘의 성격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쉽다.
이 경우 다음처럼 자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대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자신이 지금 <감각현실>○를 생생하게 얻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감각현실>○을 대한다.
그리고 일정한 관념■을 명료하게 분별해 얻는다.
그런데 자꾸 이 상황에 다음처럼 제시한다.
- 그런 관념■이 있지 않다 -
왜 그러한가.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일정한 <감각현실>○를 대해 관념■을 일으킨 것뿐이다.
그리고 그런 관념■은 단지 그런 관념영역에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다음처럼 여기면 곤란하다.
- 그런 <감각현실>○에 그런 관념■이 들어 있다 - [X].
이처럼 여기면 곤란하다.
따라서 혼동을 일으키면 곤란하다.
그런데 영역이 각기 다른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들 사이에서도 사정이 같다.
즉, 본바탕실재ㆍ<감각현실>ㆍ각기 종류가 다른 <감각현실>들ㆍ관념 들이 있다.
이들 상호간에도 사정이 같다.
* 이런 망상분별의 문제가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을 관련부분에서 반복해 살피게 된다.
[참고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킴]
[참고 ▣-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참고 ▣- 무상삼매 ]
[참고 ▣- 관념이 실답지 않은 사정 - 환자와 가족의 비유를 통한 이해]
♥Table of Contents
▣- 아상(我相)[자신에 대한 상]
경전에서 다음을 제시한다.
<감각현실 A>에 관념 b@가 있지 않다.
이는 다음 사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 그 상태에서 <감각현실> A를 얻지 못한다 [X]
- 그 상태에서 관념영역에 그런 관념 b@를 일으키지 못한다 [X]
- 그런 b@가 관념영역에 없다 [X]
-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념 b@을 얻으면 안 된다 [X]
이런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우선 <감각현실> A는 그 상황에서 그처럼 생생하게 얻고 있다.
- 한편, 그 상태에서 관념 b@를 일으킨다.
- 한편, b@는 관념영역에 그런 형태로 있다.
- 관념 b@는 관념영역에서 그처럼 명료하게 얻는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감각영역에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관념을 일으켜 얻는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꽃이나 바위가 있음을 분별한다
이러한 것도 이와 사정이 같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런 관념들일으켜 얻는다.
그래서 이는 위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는 다음을 제시한 것이다.
- <감각현실> 안에 그런 <관념 >이 있지 않다 -
즉 여기서는 다음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 <감각현실> A부분에 관념 b@는 있지 '않다'.
- 또 <감각현실> A부분은 관념 b@가 '아니다'.
또 반대로 다음도 제시한다.
- 관념 b@는 그런 <감각현실> A를 그 구성요소로 갖지 않는다.
- 관념 b@는 그런 <감각현실> A가 아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각 내용에서 서로 혼동을 일으키면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망집을 바탕해 현실을 대한다.
그런 망집에 바탕해서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감각현실 가운데 일정 부분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
- 또 다른 일정 부분은 영희나 철수'이다' <타인>
- 또 다른 일정부분은 다른 생명체(고양이, 개, 나무 등등)'이다' <그외 타생명체>
- 또 다른 일정 부분은 바위'이다' <무생물체>
이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분별이 있다.
이는 아상(我相)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곧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를 다음처럼 표현한다.
- 아상(我相)을 취한다. -
그리고 이 부분이 망상분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으키는 문제가 심대하다.
현실에서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크다.
한 주체가 일으키는 집착이 있다.
그런데 이런 집착 대부분은 이에 바탕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인다.
그래서 다음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 그런 분별은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망상분별을 잘 제거해야 한다.
- 비유를 통한 설명
<비유>를 들어 이 문제를 살펴보자.
어떤 이가 벽돌(감각현실)을 자신의 지갑(관념)으로 잘못 여긴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그 벽돌을 대하며 잘못 업을 행하게 된다.
<벽돌 >을 지갑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를 취해 들고 갈 수도 있다.
또 벽돌을 누군가 손댄다.
그러면, 지갑을 훔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다.
1. 그래서 이 경우는 다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벽돌이 지갑이 아니다 -
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다음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2. 그러면 그러한 <벽돌 >의 본 정체가 무엇인가?
3 또 반대로 <지갑 >은 대신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이런 노력으로 다음을 이해한다고 하자.
- 벽돌이 지갑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로 인해 벽돌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벽돌은 여전히 벽돌 그대로 얻는다.
또 지갑이라는 관념도 그대로 마음에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망상분별만 제거된다.
- 벽돌이 지갑이다. [X]
즉 이러한 잘못된 분별만 제거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일으키는 행동만 중지된다.
즉 <그런 망상분별에 기초한 업>만 중지된다.
그래서 그러한 업을 행하려는 의지가 제거된다.
그러면 위와 같은 업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4 그런데 이후 다음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벽돌은 지갑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자꾸 다음처럼 여기게 된다.
- 즉, 벽돌이 지갑이다. [X]
그런 경우 <그렇게 잘못 여기게 되는 배경사정 >까지 함께 잘 이해해야 한다.
5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임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수행)
- 자신에 대한 분별의 경우
현실에서 <자신>에 대한 분별도 벽돌의 비유와 마찬가지다.
현실에서 평소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이를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가 묻는다고 하자.
이 때 자신이 일정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
1. 그런데 그 부분의 본 정체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2.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정체부터 잘 확인한다.
- 그 부분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들이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 5온]
- 그 부분은 자신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
3. 한편, 그런 경우 이제 다음을 대신 알아내야 한다.
- 그러면 그 부분 대신 실질적으로 자신으로 가리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자신이란 관념으로 가리킬 부분을 찾는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
- 그 부분은 본래 자신이 아니다.
- 그 부분 대신 실질적으로 자신으로 가리켜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 그러한 부분은 차라리,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다
4 그래서 다음 내용을 이해한다고 하자.
- 그 부분은 본래 자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현실에서 다음처럼 잘못 여기고 임하게 된다.
- 그부분은 자신이다. [X]
그래서 그렇게 임하게 되는 배경사정을 또 잘 살펴야 한다.
이는 생을 출발하기 이전에 일으킨 망상분별 때문이다. [구생기 번뇌]
즉,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임한다.
그리고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망상분별을 먼저 일으킨다.
즉 잠재된 근본 정신 영역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구생기 번뇌]
[아견, 아애, 아취, 아만 ]
이후 이를 기초로 다른 정신과 신체 부분을 분화 생성시킨다.[3능변]
그리고 그런 기초에서 이후 생을 출발한다.
그리고 이후 현실의 생활은 이에 기초해 이뤄진다.
그래서 현실에서 기본적 생리작용이 이에 기초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후 감각과 분별은 이에 기초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들이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이다. [제1~6식]
그래서 다시 그런 잘못된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분별기번뇌]
사정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자.
즉 현실에서 잘못된 분별을 행하게 되는 배경 사정은 이와 같다.
그 상태에서 이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잠재적 정신에 기초한 생리적 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 그전까지 대하던 <감각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자신이란 <관념 >이 관념영역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대해 일으킨 <망상분별>만 사라지는 것뿐이다.
5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현실에서 임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곧 수행 목표와 그 성취를 위한 수행 방안과 관련된다.
이는 다음에 이어서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아(我)의 유무 논의의 효용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제 망집을 벗어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삶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경우 차이가 크다.
관념영역에서 처음 그런 잘못된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 그러면 이후 이를 바탕으로 소원을 일으킨다.
→ 그리고 다시 업을 행한다.
즉, 일정한 뜻과 말, 행동 자세 태도를 취한다.
이 경우 관념영역에서 의지를 갖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운동신경을 반응시킨다.
그래서 동작을 취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감각현실> 내용이 결과적으로 변화한다.
이 경우 이는 그 자신의 마음내용만 단순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각 주체는 본바탕 실재를 바탕으로 <감각현실>을 얻는다.
다만 실재는 한 주체가 직접 얻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감각현실> 내용만 놓고 살피게 된다.
그래서 <감각현실>이 변화된다고 하자.
→ 이 과정에는 본바탕 실상이 관여한다.
→ 그리고 이 실재를 다수 주체가 함께 바탕해 임한다.
→ 그래서 이로 인해 다른 주체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된다.
→ 그래서 이런 경우 다른 주체들과 자연스럽게 가해 피해관계가 쌓이게 된다.
→ 그리고 이로 인해 상호간 업의 장애현상이 나타난다.
→ 그리고 3악도의 생사고통에 장구하게 묶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처음 원인 부분을 잘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예방해야 한다.
현실에서 다음처럼 잘못된 판단을 한다.
즉,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 >을 취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그 가운데 일정부분 > 이 곧 <자신>이다. [X]
이처럼 잘못 여긴다.
이는 앞에서 '신견'으로 살핀 내용이다.
그런 경우 다음처럼 다시 잘못 판단한다
그 일정 부분에 자신이 들어 '있다'. [X] [유무판단]
이 경우 다시 자신과 관련한 상견 단견으로 나아가기 쉽다.
그래서 다시처럼 잘못 이해한다.
- 그런 자신은 늘 있다. [x] [상견]
또는 다음처럼 이해하기도 한다.
자신은 사후 아주 없게 된다. [X] [단견]
또는 자신은 생멸한다. [X] [생멸, 무상]
즉 <없다가 있다>, 또는 <있다가 없다> [X]
이처럼 잘못 여긴다.
이런 식으로 유무와 관련해 잘못된 망상 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각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경우마다 집착의 정도가 심해진다.
또 이도 인해 인과 판단 범위도 좁게 갖는다.
이런 폐해 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견해를 제거해야 한다.
결국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잘못 여기지 않아야 된다.
현실에서 어떤 이가 영희가 어디 있는가를 손으로 가리킨다고 하자.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발이 어디 있는가를 손으로 가리킨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일정 부분을 자신의 손발로 가리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i 라고 표시해 보자.
이경우 다음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현실에서 그런 일정 부분 i 부분이 자신의 몸이다' [X]
또 그런 일정 부분 i 부분에 자신의 몸이 '있다'[X]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i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게 되는 사정이 있다.
그 부분에 일정한 특성 jklmn 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常) 일 (一) 주(主) 재(帝) 정(浮...
이런 특성이 그런 i 부분에서 얻어진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 i부분은 바위나 의자와 특성이 다르다고 여긴다.
바위나 의자로 여기는 부분에서는 그런 특성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우선 그런 부분에는 본래 그런 관념분별 내용 자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런 감각 현실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2분법상의 망상분별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 본 바탕 실재 영역도 그 사정이 마찬가지다.
한편 그런 i 부분이 갖는다고 생각하는 특성 jklmn 도 마찬가지다.
엄격하게 살피면 i 부분은 그런 특성을 갖지 않는다.
그 사정은 현실에서 눈 한 번만 감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을 갖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
즉 상(常) 일 (一) 주(主) 재(帝) 정(浮)... 이런 특성은 i 부분이 갖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을 얻게 한 근본 정신>과 <그에 기초한 기제>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나 이런 근본 정신(제8식, 아뢰야식) 자체도 참된 진짜 실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들 부분에 갖던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일으킨 <소원>도 잘 제거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행하던 <업>도 중단한다.
이런 <망상분별>과 <업>의 제거를 먼저 현실에서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망상분별을 잘 제거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들은 <태어난 이후 일으킨 망상 분별>이다. [분별기 신견, 변견]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 단계부터 일으킨 망상분별>은 여전히 남게 된다. [구생기 신견, 변견]
그리고 생을 유지하는 한 이런 <구생기 신견>에 바탕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 이해만으로 <근본 번뇌>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별기 번뇌>부터 잘 제거해야 한다.
이 부분이 현실에서 많은 <업>을 일으킨다.
그래서 <분별기 신견>을 방치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폐해가 증가된다.
그래서 일단 <분별기에 일으킨 망상분별>부터 잘 제거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근본 정신에서 기초한 생리적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감각>은 여전히 일정 부분에서 얻게 된다.
또 이에 기초한 <정서적 의지적 번뇌>도 사정이 같다. [구생기번뇌, 수혹]
또 그에 바탕해 <정서적 의지적 반응 >을 계속 일으키게 된다.
이는 <평소 자신으로 잘못 여긴 부분>과 모두 관련된다.
그리고 이는 이론의 이해만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을 유지하는 한 이 상태가 지속된다.
따라서 추가 수행을 통해 <정서적 의지적인 번뇌의 제거>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는 이론처럼 쉽지 않다
감각과 느낌, 생각, 의지 등이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꾸준히 계속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망상분별>에 바탕해 <신구의 3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꾸준히 계속 해나간다.
이는 욕계 상황에서는 <생리적인 본능적 충동>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그런 수행을 하는 경우 일단 <생리적 불쾌나 고통 >을 겪게 된다.
그래서 수행 중 이런 불쾌나 고통을 평안히 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대로 생사현실에서 성취할 내용은 그것대로 잘 성취한다.
즉, <계>와 <정>과 <혜>의 수행을 잘 닦아야 한다.
그리고 쌓여진 <업의 장애>를 잘 제거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생사과정에서 <근본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수행에는 자신이 <생사 고통 묶임>에서벗어나려는 수행이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다른 이를 <생사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보살 수행도 있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꾀하는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이들 중생들은 생사현실에 묶여 있다.
따라서 수행자는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중생이 일으킨 망집에 같이 맞춰 임해야 한다.
그런 경우 2중적인 측면을 취해 임해야 한다.
수행자가 그런 취지로 생사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생과 마찬가지로 망상 분별을 기초로 현실에 임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망상분별을 한편으로 잘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의 극심한 생사고통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편 생사현실에서 다른 중생을 제도할 방편을 잘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무량한 복덕>과 <지혜 방편>을 잘 구족해야 한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한다.
그리고 <성불>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생을 잘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중생을 <제도>한다.
그리고 다른 중생들도 끝내 이런 상태가 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처럼 양 측면에서 수행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중생제도를 위한 <생사현실의 수행 과정>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생멸 및 왕래에 대한 상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를 대해 일정한 관념[想 saṁjñā]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자신, 생명, 수명, 남ㆍ녀, 생ㆍ주ㆍ멸 등등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상을 찾아 취한다.
예를 들어 마음에서 연필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방에서 연필을 찾아 대는 것과 같다.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 a >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a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그가 취하는 'a의 상'[상相]이다.
즉 그는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그런 부분이 곧 그런 a'이다' [X]
그리고 그런 생각에 바탕해 <감각현실> 일정 부분[상相]을 오려내 취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갖는 부분'[상相]은 본래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관해야 한다. [무상삼매無相三昧]
그렇지만, 대부분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그런 부분이 곧 그런 a'이다' [X]
- 그런 부분에 그런 '분별내용 a'가 들어 '있다' [X]
이처럼 잘못 여긴다.
분별 내용 A가운데 특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
우선 '자신'이나 '타인' '타 생명'이 있다.
이를 자신이 중요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일정 부분이 자신이나 영희 철수다. [X]
- 또 그런 부분에 그런 자신이나 영희 철수가 그처럼 '있다'. [X]
이처럼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생사'나 '생멸'의 관념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자신이나 영희나 철수의 '생사'가 있다. [X]
- 현실에 생멸이 있다. [X]
- 예를 들어 영희가 태어난다. [X]
- 그리고 살다가 죽는다. [X]
- 그래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다. [X]
- 그래서 현실에 영희의 생사가 있다. [X]
이처럼 잘못 여긴다.
또 예를 들어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예를 들어 색ㆍ성ㆍ향ㆍ미ㆍ촉 <감각현실>을 모두 색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다음처럼고표현한다.
색이 생멸한다
이 경우 <감각현실> 안 <여러 내용이 들고 나는 것>을 곧 생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런 가운데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현실에 연기와 재 등의 생멸이 있다. [X]
예를 들어 종이를 태워 연기나 재가 나타난다.
이 경우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연기나 재는 <없다가 있게 된다> [X]
또 종이는 <있다가 없게 된다> [X]
이처럼 잘못 여긴다.
그런 사정으로 각 내용의 <유>ㆍ<무>, <생 >ㆍ<주>ㆍ<멸>의 인과를 찾아 나선다.
한편, <운동 변화와 관련된 관념 >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영희가 저기에서 여기로 오고감이 '있다' [X]
또 이는 생사과정에서는 <생사왕래>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상을 취한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감각현실> 영역에서 그런 관념과 같은 내용이 있다. [X]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상을 취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핀 <유무> 문제와 모두 관련된다.
그런 경우 먼저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관념 a >가 하나의 <감각현실> 단면에서 일으킨 내용이라고 하자.
- 그래도 <감각현실>의 한 단면에서 그런 <관념 a>는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생멸>이나, <생사>는 <유무가 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 관념 >이다.
예를 들어 <생>은 '<없음>'과 '<있음>'의 <복합 관념 >이다.
이런 <복합 관념>은 사정이 더욱 그렇다.
<왕래>, <운동> 등은 <변화와 관련된 복합 관념 >이다.
예를 들어 왕래에서 '옴'은 다음을 뜻한다.
- 이전에 저곳에 <있었다>. 그리고 움직여 지금 이곳에 <있다.>
즉, 이런 형태로 <각 관념이 결합되어 묶인 관념 >이다.
그래서 이들은 본래 한 단면의 <감각현실>에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이들 관념은 상응한 <감각현실> 단면을 2 이상 필요로 한다.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의 관념들은 <감각현실> 한 단면에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렇다고 여러 다수의 <감각현실>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련의 <감각현실>을 대하는 가운데 <그런 관념 ㄱ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현실에서 <감각현실>을 대해 <일정한 관념 >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처럼 잘못 이해한다.
- 이런 관념내용이 그런 <감각현실> 영역에 그처럼 자리 잡고 '있다' [X]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망집>에 바탕해 현실을 대한다.
따라서 다음을 서로 잘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본바탕 실재 >를 바탕으로 눈을 뜸 => 일으켜 얻음 => <감각현실>
<감각현실> => 일으킴 => 느낌
<감각현실>, 느낌 => 일으킴 => 관념
관념 => '가리킴' => <감각현실>, 느낌
이 경우 <감각현실>ㆍ느낌ㆍ관념 등이 마음 안에 동시에 <병존>한다.
이런 각 내용은 <한 주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내 >용이다.
그러나 위에 나열한 <상호 관계>는 <다음 망상분별 내용>과는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위 경우에 <다음처럼 잘못된 망상분별>을 일으키기 쉽다.
즉,
<감각현실> 안에 관념이 '있다.' [X]
<감각현실> 일정부분의 정체가 그런 관념'이다'. [X]
관념이 그런 <감각현실>을 관념의 구성요소로 한다. [X]
관념이 곧 그런 <감각현실> 일정부분이다. [X]
그러나 위와 같은 이해들은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반적 >으로 이런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망집>을 바탕으로 현실에 임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
그래서 또 경전의 표현이 가리키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경전에서는 다음 내용을 제시한다.
어떤 이가 <일정한 내용>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 유무를 현실에서 문제 삼는다.
- 그런데 현실 상황에 그런 내용 자체를 얻을 수 없다.
- 우선 <감각현실> 영역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일체 얻을 수 없다.
- 그리고 그 생멸이나 생사 또한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망상분별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그런 관념을 <실답게 있는 내용>으로 여긴다.
그리고 <집착 >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생사고통 >을 겪게 한다.
따라서 <처음 일으킨 망집>이 <생사에 묶이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망상분별>을 제거해야 한다.
즉, 현실에서 일정한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이런 분별바탕으로 <그에 해당한 내용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그런 부분>을 곧 <그런 관념내용>으로 여겨 취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상>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무상해탈삼매]
따라서 경전에서 다음처럼 제시한다.
현실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보살 수행자 >가 아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
이상은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184 ~199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연구참조자료/08장_0부파불교.txt
< 관련부분 > 작업중파일/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 184 ~199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
▼▼▼-------------------------------------------
이상은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200 ~245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연구참조자료/08장_0부파불교.txt
< 관련부분 > 작업중파일/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200.txt
< $ 200 ~245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에 대응하지 않은 관념의 현실 유무 문제
관념은 반드시 <감각현실>에 대응해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상상만으로 <어떤 내용>을 연상해 떠올릴 수도 있다.
단순히 달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 달로부터 다시 <다른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감각현실>을 배경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즉, 이들은 처음부터 <감각현실>을 배경으로 일으킨 관념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내용이 <감각현실>에 있는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한편, <감각현실>에 대응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시 <추상명사>나 <집합명사>를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원에서 쉬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을 보았다고 하자.
그런 사정으로 현재 상태가 평화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화>를 떠올릴 수 있다. (추상명사)
그리고 <군대>를 떠올릴 수 있다. (집합명사)
그런 경우 <평화>나 <군대>가 그 구체적 현실에 대응하는가가 문제된다.
또는 명사 이외 <접속사> <조사>나 <부사> <형용사>도 있다.
예를 들어, <그러므로>, 꽃<-은>, <매우>, <아름답다.> 등과 같다.
이런 경우 이들 관념이 구체적 현실에 실재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런 논의가 <'유명론>'과 <'실재론'>의 논의로 한 때 서양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 이 논의는 <유개념>에 국한된 논의였다.
그리고 서양 유명론 논의에서 <'실재'>는 <관념>이 <감각현실 영역에 '있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그래서 불교 논의에서 <본바탕 영역을 가리키는 실재(진여, 실상)>와는 의미가 다르다.
불교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일체 관념>은 <감각현실>에서 본래 얻을 수 없다.
이 경우 관념에는 고유명사나 물질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추상명사 등이 다 포함된다.
또 상대적 개념, 운동 변화 관련개념, 유개념, 종개념 등도 다 포함된다.
기타 언어 표현상 사용되는 단순한 언어관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예: 조사, 접속사, 글자, ...)
즉, <모든 관념>은 <감각현실 영역>에서는 본래 얻을 수 없다.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대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감각현실 영역에 그런 관념이 '있고' '없음'의 문제>와 다르다.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대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런 사정으로 <감각현실>에 일정한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는 그 관념이 관념영역에서 일으켜져, <관념으로 있는 상태>일 뿐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음처럼 여긴다고 하자.
- <감각현실>에 그런 관념이 들어 있다. [X]
이런 경우는 모두 망상분별이 된다.
존재 일반을 살핀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일정한 분류체계>로 존재 일반을 나누어 살피기도 하다. [5위법]
이런 경우 관념은 <불상응행법>의 범주로 살핀다.
이는 분류 체계상 색(감각현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심, 심소(정신, 정신작용) 범주에서 속하지 않는다.
또한 무위법(생주별 변화를 떠난 것)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 안에서 얻어낸 대표적 관념적 내용들을 따로 묶는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불상응행법이라고 분류해 넣는다.
(예: 시간, 방위,수數...) 1
다만, 유무 논의에는 다양한 성격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그런 관념내용이 <그 자체 관념 영역>에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삼을 수 있다. [→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이는 <다른 성격의 유무논의>와 다르다.
따라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색심불상응행법으로써 어떤 내용의 유무를 살핀다고 하자.
이 경우는 오히려 이런 성격에 가깝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실다운 내용인가를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한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처럼 있는가가 주된 초점이다. [→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이것이 그 내용이 꿈과 달리 실다운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꿈은 생생하게 꾸더라도 그 내용을 침대가 놓인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처럼 쉽게 판단하게 된다.
→ 꿈은 아무리 생생해도 실답지 않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꿈과 달리 실다운 것인지를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도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그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도 있는지를 초점으로 논의 한다,
따라서 각 경우 <유무판단>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025/10/15
More Indochine
https://youtu.be/PlPEKCZzcPU?si=dlKAqXg--PtkeV9b
♥Table of Contents
▣- 실재 영역과 관련한 유무 문제
<현실 내용>은 대단히 생생하다.
그리고 명료하게 얻는다.
그런데 이런 <현실 내용>이 실다운가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현실 내용>만 살펴서는 알 수 없다.
<현실이 실다운가>는 <다른 영역>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실재>를 살피는 것은 이런 사정이다.
<실재>는, 일정 주체와 관계없이 있다고 할 <본바탕>을 뜻한다.
그래서 <본바탕>이 되는 '실재'를 살핀다.
그리고 이런 <실재 영역>과 관련되어 <유무 논의>가 행해진다.
이는 <현실 내용>이 꿈처럼 <실답지 않은가>를 살피기 위함이다.
이 경우 먼저 '실재 영역'에 <현실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다.
[→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실재>가 무언가를 살핀다.
따라서 다음 차원의 <유무 논의>와 구분해야 한다.
<현실 내용>이 <현실 영역>에 있다. 없다 [→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실재내용>이 <실재 영역>에 여여하게 있다, 없다. [→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이런 논의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실재>는 한 주체와 관계없이도 자체적으로 그대로 있다고 할 <본바탕 내용>이다.
<실재 >는 현실 내용의 <본바탕>이 되는 내용이다.
<현실내용>은 이런 <실재>를 바탕으로 얻는다.
그런 것을 여기서 <실재> 또는 <진여> 등으로 칭한다.
그런 <실재>를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실재>는 전혀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주체는 <자신의 마음이 관계한 내용>만 얻는다.
즉 <마음이 관계해 화합해 얻어내는 내용>만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삼는 <실재>는 그런 관계를 떠난 내용이다.
따라서 <그런 실재>는 한 주체로서는 끝내 얻지 못한다. [불가득]
=> 따라서 실재는 모든 <2분법적인 분별>을 떠난다. [불이법]
즉,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과 같다 ~과 다르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등등의 분별을 모두 떠난다.
또한 그런 사정으로 <언설>을 떠난다.
사정이 그렇다고 이에 대해 아무런 언설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일반인이 그 상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런 언설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방편상 <공>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게 된다.
여기서 <공>은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렇게 언설로 <공>이라고 표현한다.
때문에 또 이 표현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현실 사정상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일단 방편상 <공>하다고 표현해 제시한다.
그러나 이 <공>이란 표현은 다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무엇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 [X]
또 < 실재영역에서 무엇을 얻는다>. 그것이 공(空)이라는 내용이다. [X]
실재는 공(空)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내용>이다. [X]
실재영역에는 공(空)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내용>이 있다. [x]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즉 <공>은 <'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또는 <'유>'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얻지 못함은 <있고 없음>의 <2 변>을 떠남을 말한다.
즉, 얻지 못함은 없음[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또 a라는 무엇이 있음[유]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 있고 없음의 분별을 모두 떠남]
또 <공>은 <실재>에 대해 <어떤 성품>을 얻어서 이를 기술한 내용이 아니다.
이는 비유하면 다음 경우와 같다.
눈은 소리를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눈으로는 도레미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소리를 얻지못한다.
그렇다고 다음처럼 제시할 수는 없다.
→ 소리가 전혀 없다. [X]
→ 소리영역은 모두 똑같이 얻지 못하는 하나의 동일한 내용이다 [x]
이와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눈 입장에서는 도레미.... 피아노 소리를 모두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소리가 <있고 없음>을 말할 수 없을 뿐이다.
이제 <현실내용>이 <실재영역>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다.
[→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현실에서 얻는 내용 가운데 <감각현실>과 <관념>이 있다.
이들을 각기 놓고 생각해보자.
먼저 <감각현실>을 놓고 살펴보자. [색,성,향, 미,촉]
예를 들어 이 가운데 눈으로 보는 색을 놓고 생각하자
그러한 <감각현실>이 실재영역에 있는가, 없는가.
실재는 그 내용을 한 주체가 직접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는 <유무 분별>을 모두 떠난다.
그래서 실재 영역에 특정한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재 영역에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한다.
<관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실 내용>과 <실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 얻는 내용>가운데 <감각현실>과 <관념>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현실 내용>은 각 주체가 <얻는다>.
그러나 <본바탕 실재>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실재> 의 영역에 <현실 내용>이 그대로 일치한 형태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재 > 의 영역에 <현실 내용>이 그대로 일치한 형태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현실>은 <실재>가 아니다.
<실재>도 <현실 >이 아니다.
[→ 한 내용의 다른 영역 내용과의 관계에서의 정체판단 → .-이다,아니다 사실판단]
그러나 <현실>과 <실재>는 서로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 아니다.
현실은 <실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재>도 현실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 이들의 관계는 <침대>와 <침대에서 누워 꾸는 바다 꿈>의 관계와 같다.
<현실 내용>은 현실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얻는다.
그러나 <본바탕>에서나 <다른 영역>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지 못한다.
이는 마치 <침대에서 누워 꾸는 바다 꿈>과 <그가 누어 자고 있는 현실의 침대>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통해 다음을 이해할 수 있다.
→ <현실>은 마치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사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수행에서는 그 방향이 다른 다음 형태가 있다
먼저 성문승과 연각승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그 자신이 생사 윤회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3계 생사 현실 밖으로 나간다. [해탈, 회신멸지 무여열반]
그러나 대승보살승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생사 현실 안에 있는 다른 중생을 제도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생사 현실 안에서 법신을 증득하고 성불한다. [사홍서원]
이런 경우에는 그 수행자가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 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이런 경우 수행자는 다음이 전제가 된다.
→ 그 자신부터 먼저 망집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 그리고 생사 현실에서 겪는 생사 고통을 평안히 참고 견딜수 있어야 한다.
→ 그래서 생사 고통에 직면해서 수행에서 물러나면 안된다.
[안인성취, 무생법인 증득, 불퇴전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음을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생사 현실이 본바탕이 공하다. 그래서 그 성격이 꿈과 같다.
이런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 현실에서 <수행 중 겪는 고통>도 평안히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생사 현실>에서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도 원만히 성취해 나갈 수 있다.
즉 <생사 현실 >에서 <얻을 바 없음>을 방편으로 집착없이 수행을 행한다.
그래서 수행을 원만히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현실에서 무언가를 얻을 바가 있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래서 현실에서 무언가를 대가로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자.
이는 그 자신이 그 수행 자체에 망집을 일으킨 상태다.
그리고 망집을 기초로 수행을 행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 그로 인해 그 수행의 성격 자체가 변질된다.
그런 경우는 그 수행은 마치 다음과 같다.
즉 <현실 시장에서 행하는 상거래 행위>와 성격이 같게 된다. [ → 시역법市易法]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록 수행을 하더라도 원만한 수행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空)의 이해는 이런 부작용을 수행 과정에서 제거해 준다.
따라서 이런 측면은 대승보살 수행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따라서 경전에서 <실재의 공함>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한다.
실재 영역에 대해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고 하자.
- 실재 영역에 <현실 내용>이 그대로 그와 같이 있다. [X]
그러면 또 그런 사정으로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 <현실 내용>은 꿈과 달리 <실답다>. [X]
이처럼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런 경우 현실에 <집착>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묶인다.
따라서 <실재의 공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망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해탈삼매]
♥Table of Contents
▣- 실재의 <유무> 논의와 <생사고통>
실재는 <공>하다.
실재에서는 현실과 같은 <차별>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실재가 <실재를 아는 일>도 없다.
또한 <생멸>이나 <생사>, <고통>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사정으로 실재영역에서는 <생사고통>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도 없다.
<생사고통>은 <생사현실 안>에서의 문제다.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이 <생사고통>을 해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 <실재>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생사현실 안>에서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
- 본바탕인 <실재>가 얻을 수 없어 <공>하다.
그리고 <현실>과 이 <실재>를 서로 대조해 살펴야 한다.
즉, <현실 내용>은 대단히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는다.
그런데 본바탕 <실재>는 한 주체가 그 내용을 끝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방편상 공하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본바탕 <실재>에서는 그런 <생사현실>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실재>에 그런 <생사현실>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실재영역>에서의 <현실 내용>의 <유무 논의>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이처럼 <실재>의 사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을 이해한다.
-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현실 생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이런 이해는 <생사현실 안>에서 행한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다.
꿈을 꾸며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꿈 안>에서 인식한다.
이런 경우와 같다.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꾸어 고통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꿈을 깨면 <꿈>인 것을 안다.
그러나 <꿈을 꿀 때>는 모른다.
그러면 <꿈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꿈을 꾸면서> 그것이 꿈임을 안다.
그러면 꿈을 <꿈 밖 침대>에서 대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꿈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생사현실 안>에서 실재 영역의 사정을 이해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다음 사정을 이해한다.
실재영역에서 <현실 내용과 일치한 내용>을 얻을 수 없다.
실재영역에서 이들 <현실 내용>은 있다고 할 수 없다 .
본바탕 <실재>는 한 주체가 그 내용을 끝내 얻을 수 없다.
한 주체는 오직 그와 관계한 내용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삼는 실재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도 그대로 있는 본바탕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 실재는 <일체 2분법상의 분별>을 떠난다. [不二法불이법]
즉 유무, 생멸, 상단, 일이一異, 선악, 미추 등의 분별을 모두 떠난다.
따라서 실재는 언설 표현도 역시 떠난다. [言語道斷언어도단]
다만 그렇다고 실제가 문제될 때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이가 그 내용을 전혀 헤아리기 곤란하다.
그래서 방편상 공(空)이라는 언어 표현을 빌려서 나타낸다.
여기서 공(空)은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언어 표현도 방편적인 가설인 것이다. [空空공공]
그런데 <현실>은 매순간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는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의 차이는 크다.
그래서 <현실>은 <꿈>과 성격이 같다.
즉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다음을 이해한다.
- 현실은 꿈처럼 <실다운 내용>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
그러면 현실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업>을 잘 제거 중단할 수 있다.
그런 바탕에서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잘 성취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생사고통>을 직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바탕>의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다음을 이해한다.
- 그런 생사고통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
또 본 바탕에서는 그런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본 바탕>의 측면으로 현실을 대한다.
또는 생사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해서 대한다
그러면 그 <고통>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이측면은 대승 보살 수행자에게 특히 더 필요하다.
대승 보살 수행자는 성문 연각 수행자와 수행 방향이 다르다.
성문 연각 수행자는 생사 윤회의 묶임을 벗어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끝내 3계 생사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보살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중생이 있는 욕계 생사 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또 그런 사정상 생사 현실에 임해 생사 고통을 평안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정상의 공의 이해는 대승 보살 수행자에게 더더욱 강조된다.
또 그런 사정상 <실재영역>에서의 <유무논의>는 중요하다.
그리고 <생사현실안>에서 <실재>의 사정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의 <생사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실체>의 유무 문제
- <실체유무>가 논의 되는 이유
현실에서 <생사 고통>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먼저 이러한 <현실 내용>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다음을 문제삼게 된다.
- 현실내용이 <꿈>과 달리, <실다운 내용인가>?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만일 <현실>이 <꿈>과 달리 <실다운 것>이라고 하자.
그 경우 <생사현실>내 문제를 꿈처럼 <실답지 않다>고 여기고 대한다고 하자.그러면 곤란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 이에 대한 <집착>도 제거하기 쉽지 않다.
그런 경우 <생사 현실>문제는 정면으로 대응해 해결할 문제가 된다.
즉 이경우 <생사현실>내 <생사고통>은 실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실다운 <생사고통>을 겪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노력에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상태>를 성취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주로 <인천교>적 방안이 된다.
즉, <하늘>에 태어남을 목표로 하는 기초 예비 수행이 주된 방안이 된다.
그러나 현실이 꿈처럼 <실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처럼 제시하게 된다.
생사고통을 해결할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방안>은 다음이다.
즉 우선 현실의 <그런 사정>을 명확히 잘 깨닫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집착>을 제거한다.
이런 방안이 중요한 해결방안이다.
이렇게 제시하게 된다.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러나 현실이 또 완전히 <꿈 자체>는 아니다.
꿈을 실답지 않다고 보게 하는 꿈이 갖는 특성이 있다.
이를 abc라고 하자.
한편 현실은 꿈과 달리 실답게 여겨지는 특성도 있다.
이를 defg라고 하자.
그래서 현실은 abc + defg 특성을 함께 갖는다.
즉 현실이 <꿈>과 성격이 일부 같다.
그러나 현실은 또 <꿈>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현실에 임하는 주체는 현실이 꿈과 달리 갖는 특성에 매몰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다음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
이런 사정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한편 <꿈>은 자다가 꿈을 깬다고 하자.
그러면 <꿈>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생사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그런 이해 만으로 <현실>에서 곧바로 벗어나기는 힘들다.
또한, 설령 그런 이해를 한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여전히 생사현실에서 <고통의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이해 만으로 <현실 내용>을 일시에 모두 제거해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또 그런 이해 만으로 <현실>을 원하는 형태로 <좋은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런 이해만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현실은 꿈과달리 이를 <실답게 여기게끔 만드는 특성>이 있다.
→ defg의 자세한 내용 참조
▣- 망상분별 부분이 논의핵심이 되는 사정
이들 defg 특성은 꿈이 갖지 않는 특성이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대부분 다음처럼 여기게 된다.
- <현실>은 꿈과 달리 대단히 <실답다>.
그래서 현실을 실답게 여여긴다고 하자.
그러면 <그 정도>만큼 이를 극복할 <수행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정도>만큼 <생사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 하자.
그런 경우 다음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 사정>이 앞과 같다.
그래서 <다음 수행>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먼저 현실에서 고통을 <예방>할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있는 고통을 <완화하고 제거할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점차 현실을 <좋은 상태로 만들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이들을 실천한다.
한편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가 한다.
그리고 <생사 현실>에서 상대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상태로 머물러 수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수행은 한층 더 요구된다.
그리고 이들 각 경우 다음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
- 현실이 <꿈과 같다> .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수행이 원만히 성취되게 된다.
그래서 이는 <생사 문제> 해결에서 큰 차이를 낳게 된다.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선결 문제>가 된다.
대부분 다음을 이해한다.
- <꿈>은 실답지 않다.
그런데 <실체>는, 꿈과 달리, <실다운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실체는 꿈이 갖는 abc 특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꿈이 갖는 특성과 정반대의 특성 xyz 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 그런 내용을 꿈과 달리 참된 진짜라고 관념하게 된다.
→ xyz의 자세한 내용 참조
▣- 망상분별 부분이 논의핵심이 되는 사정
x. [영원불변성, 항상성]
y. [고정성, 실질적 뼈대 ]
z. [ 참된 성품(자성) ]
그래서 어떤 내용에 <참된 실체>의 xyz 성품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만큼 <실답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것에 그러한 <참된 실체>의 xyz 성품이 없다고 하자.
그리고 또 한편 꿈이 갖는 abc 특성을 어느 정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그 만큼 <꿈과 성격이 같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만큼 <실답지 않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실다움 여부>를 판단함에 <실체>의 유무 논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제거하는 수행>에 서 중요한 <선결 문제>가 된다.
..
1023#
L'oiseau et l'enfant Marie Myriam
https://youtu.be/ny_YsJUVdBg?si=VV7c0btRUJm10h-B
♥Table of Contents
▣- 실다운 <진짜>를 찾는 사정
한 주체가 <사물>이나 <자신> 모습을 대한다.
그런데 시시각각 그 내용이 <달라짐>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어떤 꽃이나 바위를 대한다.
이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그 모습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적>이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현실에서 매번 달리 내용을 얻는다.
그렇지만, 꽃은 꽃이다.
그리고 바위는 바위다.
그리고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처럼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참된 진짜 뼈대>로서 <살체>가 있다. [X]
그렇기에 이처럼 분별하게 된다.[x]
이렇게 여긴다.
즉, 다음처럼 추리한다.
참된 진짜 <실체>가 있다. [X]
즉 그런 <참된 뼈대>가 그 안에 있다. [X]
그렇기에 현실에서 그런 각 모습을 그처럼 보게 된다. [X]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각 내용의 분별을 하게 된다. [X]
이처럼 <추리>한다.
이 경우 참된 진짜로서 <실체>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런 실체는 <꿈과는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즉, 그런 진짜는 <꿈>과는 달라야 한다.
꿈을 <실답지 않다>.
꿈을 <실답지 않다>고 보는 사정이 있다.
이미 이를 살폈다.
→ abc의 자세한 내용 참조
▣- 망상분별 부분이 논의핵심이 되는 사정
A. [임시성][조건의존성]
B.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C. [가짜성품]
꿈은 <이런 특성> abc를 갖는다.
그래서 <실답지 않다>고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처럼 <꿈이 갖는 특성> abc 를 갖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것은 그만큼 <실답지 않다>.
반대로 어떤 것이 꿈과 달리 <참된 진짜>라고 하자.
그런 경우 <꿈이 갖는 이런 특성>은 갖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꿈이 갖는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 xyz 를 가져야 한다.
→ xyz의 자세한 내용 참조
▣- 망상분별 부분이 논의핵심이 되는 사정
x. [영원불변성, 항상성]
y. [고정성, 실질적 뼈대 ]
z. [ 참된 성품(자성) ]
그래서, 꿈과는 달리 <실답다고 볼 성품> xyz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참된 진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그것을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실체>에 대한 <관념>을 이처럼 만들어 갖게 된다.
이 경우 먼저 관념 영역에서 그런 <실체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된다.
즉, 꿈과는 다른 <참된 성품>을 갖는 어떤 것을 관념한다.
이는 다음 작업이 된다.
관념영역에서 몽타주 형태로 <찾는 내용>을 그려낸다.
그래서 관념영역에서 실체에 대한 <몽타주>를 만들어 놓게 된다.
이 경우 이는 관념영역에서 만들어낸 <관념>이다.
그리고 이를 '<실체>'라고 <언어>로 표현한다.
또는 이를 '<본체>'라고도 표현한다.
또 실체가 다른 것과 달리 갖는 <성품>이 있다고 하자.
이는 <실성>, <본성>이라고 언어로 표현한다.
또는 <자성>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자성>은 <공성> <타성>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A의 <자성>은 A 자신만 갖는 성품이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그릇이라고 여긴다고 하자.
그 경우 다음처럼 여긴다.
- 그 부분은 다른 부분(식탁의자) 등과는 <다른 성품>을 갖는다.
이처럼 여겨진다.
그 부분이 갖는 성품은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그 부분이 잠시만 일시적으로 갖는 성품도 있다.
또 그 부분이 늘 갖는다고 여겨지는 성품이 있다.
한편 이들 성품에는 다른것과 함께 <공통적으로 갖는 성품>도 있다.
[ → 공통성]
한편 <그것만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품>도 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이 있기에 그것을 A라고 하게 된다.
또 반대로 다른 B는 <그런 성품>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A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구분 짓게 한다.
이러한 성품이다.
[ → 고유성]
한편 다른 B는 다른 B대로 <그것만 갖는 성품>이 있다.
[ → B의 고유성]
이를 A의 자성에 상대해 <타성>이라고 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릇의 성품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다.
a, b, c (딱딱함, 담을 수 있음, 물질로 됨)
한편 꽃은 갖고 그릇이 갖지 못한 성품을 나열할 수 있다.
d, e (암술 수술이 있음, 열매를 열리게 함 )
이경우 a, b, c를 하나하나 별개로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처럼 여긴다.
a는 그릇 아닌 다른 것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바위나 의자 등도 함께 지니고 있다.
( → 공성)
그러나 a, b, c 성품 <모두>를 묶어 하나의 성품으로 삼는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처럼 여기게 된다.
a이고 b이고 c인 성품은 그릇만 그러하다.
(→ 자성)
한편 그릇이 <갖지 못한 성품> d, e 등이 있다.
이는 그릇 입장에서는 그릇이 갖지 못한 <다른 것의 성품>이다.
(→ 타성)
그런데 이제 실체에서는 다음을 요구한다
실체의 이런 <성품>들은 모두 고정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다음처럼 판단해야 한다.
- 이 역시 <꿈처럼> <실답지 않다>.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다음이 문제된다.
현실의 어떤 것이 이런 <실체>가 정말 있는가?
또 그 실체적 <자성>이 정말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문제된다.
물론 이러한 <실체>는 관념 차원에서 <관념>으로는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또 <언어표현 > 자체로는 있다.
그러나 실체의 <유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 경우 과연 그런 관념적 <몽타주>에 해당한 것이 현실에 있는가가 문제다. [→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실체가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다.
<관념영역>에서는 몽타주 형태로 마음에서 그려낸 내용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음을 문제 삼는다.
그런 내용이 현실 다른 영역 어딘가에 정말 있는가?
그래서 이를 찾고 문제삼는다.
그리고 이는 결국 불교의 <무아ㆍ무자성> 논의다.
그리그 실체의 유무 논의는 다음과 관련해 중요하다.
즉 <현실내용>이 <실다운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다.
현실 내용이 이런 실체를 갖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을 실답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것은 <꿈처럼> 실다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이에 <집착>을 갖고 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실체의 유무 문제>는 수행에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실체의 유무>가 문제된다.
<불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그런 <실체>는 없다.
[무아, 무자성, 승의무자성, 인무아, 법무아, 무소유]
<실체가 없음>을 밝히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온 시간대 온 공간대를 통해 <실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곤란하다.
따라서 <실체 없음>은 <추론>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실체 없음>을 판단하는 추론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체의 <관념>을 관념영역에서 구상해 몽타주를 만든다.
그리고 다음을 가정한다.
- 그런 <몽타주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영역에라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경우 3개 이상의 <실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실체의 관념이 <요구하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하자.
→ 그런 경우 전 영역에 단 1개 또는 2개에 그쳐야 한다.
→ 그리고 전 영역에서 이외에 <다른 존재>를 세울 수 없다.
→ 그런 경우 <현실 내용>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즉<실체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이런 내용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한편, 현실에서 한 주체는 <현실 내용>을 얻는다.
→ 따라서 그런 실체는 반대로 <없다>고 해야 한다. [귀류논증]
그래서 실체에 대한 <추론>은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음 결론을 얻게 된다.
- 실체는 어느 영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지 대강의 <추론> 구조만을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실체의 관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 우선 어떤 내용이 다른 것과 <구분되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 그리고 <영원하고 고정되고 불변>한다.
- 그런 가운데 현재 대하는 <현실>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찾는다.
그런 경우 <이들 조건을 함께 충족시키는 내용> 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따라서 결국 다음 사실을 관념영역에서 판단하게 된다.
-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런 실체가 3개 이상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각 요구 조건이 서로 모순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곤란하다.
즉, 이런 각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가정한다.
- 세상에 실체가 a, b, c 이런 형태로 3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자.
그런데 또 이들이 각기 <고정>되고 <영원불변>하다.
그런 <실체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관념영역에서부터 모순이 발생한다.
즉 이 각 요구를 <함께 충족시킬 내용>을 세우기 곤란하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체가 a, b, c 이런 형태로 3개 이상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런 경우 위 규정상 다음과 같아야 한다.
a는
나머지 b, c도 마찬가지다.
즉 b는
또 c는
그런데 a와 b와 c는 다시 처음 규정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결국 a는
이는 다시 다음을 의미한다.
a 는 a임,
a 는
a 는 c가 아님 =[(
이 경우
먼저 b는 < a가 아니다 동시에 c 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b가 아닌 경우라고 하자.
이는 다음 여러 경우들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
→ (a가 아님) * ( c 임)
(a 임) * ( c 가 아님 )
(a 임) * ( c 임 )
→ 이는 결국 a이거나 또는 c이거나 할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하나의 내용이 서로 다른 특성인 a와 c를 오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실체의 성품은 다음을 요구한다.
→ b를 포함해 실체 성품들은규정상 <고정되고 영원불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처음 규정과 <모순>된다.
그런데 이런 각 내용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하자.
→ 그런 내용은 관념영역에서부터 규정이 서로 모순된다.
→ 그래서 세우기 곤란하다.
그러나 그런 실체가 1개 또는 2개 존재한다고 하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은 관념영역에서 세울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앞에서 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또 한편, 이외의 제3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역시 앞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현실에는 <수많은 내용>이 현실에 존재한다.
그런데 처음 내용은 현실과 같은 제3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그래서 다음을 판단하게 된다.
→ 처음 <관념영역에서 세운 실체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내용은 세울 수는 없다.
- 제3의 존재를 허용한다.
- 그러면서 동시에 앞 실체 관련 규정을 함께 충족시킨다.
이러한 내용을 세울수 없다.
따라서 결국 다음을 관념영역에서 판단하게 된다.
-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다음 사정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실체는 현실에서 <논의 실익>도 있다.
실체는 규정상 꿈과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는 <변화>를 떠난 것이다.
그런데 한 주체는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바탕에 있다.
그런데 한 주체가 현실에서 노력해 얻는 것이 있다고 하자.
이는 결국 <실체적 내용>이 될 수 없다.
만일 한 주체가 그렇게 얻는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실체가 아님>도 함께 나타낸다.
따라서 한 주체는 실체와 떨어져 있다.
설령 실체가 있다고 해도 그 사정이 이와 같다.
따라서 실체는 현실의 주체가 <논의하고 살필 실익>이 없다.
그래서 <무익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실체의 유무 논의는 다음을 판단함에 중요하다.
- 현실이 <실답지 않다>.
이런 사정을 판단함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다시 다음 내용을 제시함에 취지가 있다.
- 현실 내용에서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현실 내용은 <실답지 않다.>
- 따라서 현실 내용에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시킴에 주된 초점이 있다.
♥Table of Contents
▣- 무아ㆍ무자성과 실재의 공함의 관계
<실체없음>은 <무아>ㆍ<무자성>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공하다>는 표현은 <실체가 없음>도 함께 포함된다.
즉 <공함>은 <무아>ㆍ<무자성>도 함께 나타낸다.
그 사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실재>는 주관과 관계없이 있다고 할 <본바탕 내용>이다.
그래서 <본바탕 내용>이 무언가를 살핀다.
그런 경우 <실재>는 전혀 아무 것도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주체가 <그 내용>을 직접 끝내 얻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일체의 <2분법상의 분별>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있다ㆍ없다>ㆍ<-이다ㆍ-아니다>ㆍ<-과 같다ㆍ-과 다르다> 등의 분별을 행할 수 없다.
또 <좋다ㆍ나쁘다>ㆍ<깨끗하다ㆍ더럽다>ㆍ<선하다ㆍ악하다> 등의 분별 등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언설>을 떠나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공하다>'라고 표현하게 된다.
여기서 <공>은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표현이다.
이 경우 <공>은 <무아ㆍ무자성>과 완전히 같은 측면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재>가 <공함>을 제시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는 <참된 '실체'>는 없음[무아ㆍ무자성]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된다.
그런 가운데 '실재'는 <얻을 수 없음>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된다. (무소유+ 불가득 )
<실체의 유무 논의>에서 <어떤 A의 실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실재가 무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바로 <그런 A>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진짜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무아ㆍ무자성]
즉, 그런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
그런 경우 <실재>가 무언가 문제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실체>를 제시할 수 없다. [무아ㆍ무자성ㆍ무소유]
그런 가운데 <본바탕 실재>는 그 내용을 <얻을 수 없다>. [불가득 공]
그래서 <공하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공>이라는 표현에는 결국 <무아ㆍ무자성>도 그 전제로 포함된 것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현실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유무>논의
<현실 내용>이 실다운가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현실 내용이 다른 영역에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있다면 그만큼 꿈과달리 실답다고 할 만하다.
그래서 다음 측면에서 <유무> 논의가 필요하다.
즉 <관념>이 실다운가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관념이 <감각현실> 영역에 있는가 여부를 살핀다.
또 관념이 <실재 영역>에 있는가 여부를 살핀다.
<감각현실>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감각현실>이 실다운가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감각현실>이 관념 영역에 있는가 여부를 살핀다.
또 <감각현실>이 실재 영역에 있는가 여부를 살핀다.
한편 이들 각 경우 각 <감각현실>이나 <관념>에 <실체>가 있는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이, 꿈과 달리,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주로 이런 측면의 <유무>논의가 경전과 논서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유무> 논의 외에도 다양한 <유무> 논의가 있다.
그래서 <유무> 논의 과정에서 서로 <구분>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각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유무> 논의도 함께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관념 영역에서 관념의 유무 문제
♥Table of Contents
▣- 관념영역에서 <관념>이 얻어지는가 여부의 문제
<관념>은 <관념영역>에서 일으킨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일정한 관념>을일으켜 얻는다.
이런 경우 <그 관념>은 <관념영역>에 그렇게 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유무>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즉, 어떤 관념이 그처럼 <관념영역>에 있는가를 논의한다.
그런데 이 경우 '<있음>'과 '<없음'> 자체가 하나의 <관념분별>이다.
그리고 유무 문제도 <관념분별 영역>에서 문제 삼는다.
그리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어떤 관념내용이 <관념영역>에서 그처럼 얻어지는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즉, '<있음>'과 '<없음'>을 그런 측면에서 문제 삼는다.
그런 경우는 <유무>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무언가 '<없다'>고 문제 삼는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문제 삼는 내용> 자체는 그런 '<관념>'으로는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생각한다.
토끼는 <뿔>이 없다.
그런데 토끼뿔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의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관념영역>에서는 그런 <관념>을 일으켜 이를 문제 삼는다.
그래서 어떤 <유무 논의>가 다음 성격의 논의라고 하자.
즉, 어떤 관념내용이 <관념영역>에서 있는가를 문제 삼는 논의라고 하자.
그런 경우 세상 이곳저곳을 살필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관념 내용자체는 이미 그렇게 <관념 영역>에 있다.
즉, 관념영역에서 <관념> 형태로 있다.
그래서 이처럼 <관념>측면에서 '<있음>'과 '<없음>'을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결국 <쓸모없는 희론>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현실>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찾고자 하는 것을 <몽타주> 형태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나 <특징>과 <성품>을 먼저 <관념>으로 나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그런 <몽타주 내용> 만은 먼저 <관념 영역>에 그렇게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고 없음>을 살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논의는 별 의미 없이 장난삼아 하는 <희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행해질 경우는 별로 없다.
♥Table of Contents
▣- 유무 논의의 성격 혼동 문제
경전이나 논서에서 <유무>논의를 행한다.
그런데 <유무> 논의가 다음 성격이라고 하자.
즉, 어떤 <관념>이 <관념영역>에 있는가 여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 삼는다.
그러면 <그런 관념> 자체는 이미 그렇게 <관념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논의가 행해질 경우도 별로 없다.
그래서 경전에서 행해지는 <유무> 논의는 적어도 이런 성격의 논의가 아니다.
이런 점을 미리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유무> 논의가 <관념의 존부> 논의인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관념 가운데는 <상대관념>이나 <운동관념> 등이 있다.
또 <추상관념>, <집합관념>, <유개념> 등도 있다.
이런 경우 이런 혼동을 특히 많이 일으킨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과 상대된다.
<앞>은 <뒤>와 상대된다.
<왼쪽>은 <오른쪽>과 상대된다. [상대적 관념]
한편 <온다>, <간다>, <앉는다>, <쉰다> 등은 <동작>과 관련된다. [운동]
군인 다수가 모여 조직을 이루면 <군대>라고 한다. [집합관념]
또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은 <식물>이다.
영어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선생님은 모두 <선생님>이다. [종개념, 유개념]
또 여럿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경우 <사랑>이나 <평화>를 떠올릴 수 있다. [추상관념]
이런 다양한 <관념>을 나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유무>를 논의한다.
그래서 현실에 '<앞>'과 '<뒤>'의 유무를 논의한다.
또는 <앞시간> <뒷시간>의 유무를 논의한다.
또는 <오고감>의 유무를 논의한다.
<군대>의 유무를 논의한다.
<선생님>의 유무를 논의한다.
<사랑>의 유무를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한다.
이 때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현실에서 무언가를 대해 이런 <일정한 관념>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관념영역>에 <그런 관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감각현실>에 있다고 여기기 쉽다.
즉, 자신이 <어떤 내용>을 <관념>으로 떠올린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에 <있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그래서 각 경우 <논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
이 경우 <관념영역>에서 <그런 관념>이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혼동>을 일으키면 곤란하다.
이런 경우 <유무> 논의를 <관념>의 유무 문제로 혼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실체>의 존부가 경전에서 자주 논의된다.
이는 <가짜 진짜>의 존부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경우 이를 단순한 <관념>의 존부문제와 혼동하기 쉽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어떤 물건>을 찾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 먼저 마음속에서 그에 대해 <대강의 관념>을 갖는다.
이는 범인을 찾을 때 그리는 <몽타주>와 비슷하다.
그런데 어떤 것이 대강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를 <가짜>라고 표현한다. (가짜금, 가짜 보석 등)
예를 들어 <금>을 찾는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 <금>과 비슷하다.
그러나 <금이 아닌 물건>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종이에 비슷하게 물감을 칠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이를 <가짜 금>이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다음처럼 생각하기 쉽다.
현실에 <가짜>가 있다.
그런데 <가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에 상대되는 관념>으로 <진짜란 관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정으로 <진짜>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쉽다.
이 경우 듣기에는 언뜻 그럴 듯하다.
그런데 이는 논의 초점에 <혼동>을 일으킨 경우다.
이는 <진짜>라는 '관념'이 있을 수 있는가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또 <진짜>라는 관념을 마음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가 여부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다.
또 <진짜>라는 관념을 지금 마음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인가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다.
<진짜>라는 관념은 마음에서 일으킬 수 있다.
<진짜>라는 관념은 <가짜에 상대되는 관념>으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몽타주>도 다시 <관념영역>에서 만들어 가질 수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그러나 이 경우 <관념에 상응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현실에서 찾을 수 있나를 문제 삼는다.
이런 측면으로 <유무>를 문제삼는다.
그래서 이는 다른 <유무>논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념 내용>을 <감각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또는 <관념 내용>을 <실재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그러면 이들 경우는 위와 다르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전과 논서에서 살피는 <유무>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들과 관련해 의외로 <혼동>을 많이 일으킨다.
따라서 이를 먼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다.
♥Table of Contents
▣- <실체>의 존부 문제와 <관념>의 존부문제의 <혼동>
불교에서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이미 살폈다.
[참고 ▣- <실다운 진짜>를 찾는 사정]
그런데 이 경우도 <관념>의 유무 문제와 혼동하기 쉽다.
<실체>의 존부 문제는 다음 취지로 문제 삼는다.
<꿈>은 실답지 않다.
<꿈 내용>은 생생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꿈 내용>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얻는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 등 <다른 영역>에서 얻지 못한다.
또 <그에 기대하는 성품>들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본 바다는 짜지 않다.
이와 같다.
그래서 꿈은 그 내용을 생생하게 얻더라도 <실답지 않다>고 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도 사정이 이와 같다.
그런데 한편, 현실은, 꿈과는 달리, <참된 특성>을 갖는가가 문제된다.
현실에 <그런 참된 특성>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꿈>과 다르다.
그래서 현실은 꿈과 달리 <실답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자세>를 달리해야 한다.
그래서 <실체>의 존부 여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진짜 참된> 어떤 실체 로서의 <자신>이 있는가.
즉 본체로서의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자신의 <본성>이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고 제시한다. [무아, 무자성, 무소유, 승의무자성]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런 관념 자체>는 만들어 논의한다.
그래서 <그런 관념 자체>를 <관념영역>에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그런 <관념>을 떠올린다.
그래서 그런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이 논의를 <관념내용>의 존부 문제로 혼동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실체>의 유무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유무>를 살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을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경전에서 현실에서 <생멸>을 얻을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 경우 <생멸>이란 <관념 자체>를 못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어떤 내용이 자신의 <생각>으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고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자신이 <관념영역>에서 <그런 관념>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관념>이 <관념영역>에 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의미 밖에 갖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처럼 <관념의 존부> 측면에서 <유무>를 논의한다고 하자.
이는 <사변 철학>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경전>논의를 대한다.
그러면 경전의 <유무> 논의도 이런 성격의 논의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 주체가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받는다.
현실에서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수행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변적 내용>은 논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
즉, <희론> 성격을 갖는 내용은 논의초점이 되지 않는다.
♥Table of Contents
▣- <관념>적 차원에서 <유무> 문제들
<관념>이 일정하게 얻어지는가를 현실에서 다양하게 논의한다.
물론 이들은 <불교>에서의 <유무> 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측면에서 <유무>를 많이 문제 삼는다.
또 이는 단순히 <관념>의 존부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무> 논의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관념영역>에 <관념>이 현재 머물고 있는가의 문제
<관념>은 다양한 경로로 얻는다. (몽중의식ㆍ독산의식ㆍ정중의식ㆍ오구의식 등)
관념은 <감각현실>을 <배경>으로 일으킬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각현실>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일으키기도 한다.
또 <다른 관념>으로부터 단지 <연상>해 떠올리는 경우도 있다.
<꿈>내용도 그 성격은 관념적 내용이다.
<정려>수행 중 얻는 내용도 관념적 내용이다.
대강 이런 경우만 놓고 보자.
그런데 한 주체의 의식에 <일정한 관념>이 있는가를 문제 삼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관념>의 <관념영역> 내 존부 문제가 된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그런데 이런 형태로 <관념>의 <존부>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학>문제에 답이 '있다' '없다'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 수학문제를 풀거나 풀지 못했는가 여부로 <답의 유무>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단지 연상되어지는 <일정한 내용>의 <유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또는 <과거에 기억한 관념>을 지금 떠올릴 수 있는가 여부로 유무문제를 삼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관념영역에서 <관념>의 존부를 문제 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차원의 <유무> 논의가 많다.
그래서 <불교>의 유무 논의와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미리 이들 각각의 성격을 잘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수학문제에서 답의 '유무' 논의
관념영역에서 여러 조건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관념>이 얻어지는가를 문제 삼을 경우가 있다.
이는 어떤 관념이 <일정한 규정>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문제 삼는다.
예를 들어 <수학>문제를 놓고 보자.
제곱해서 2가 되는 정수가 있는가가 수학문제로 제시된다.
그런 경우 그런 정수는 '없다'고 답하게 된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정수'라는 <생각>자체는 할 수 있다.
다만 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리고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어떤 수가 이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수>는 없다고 제시한다.
이는 그런 수에 대해 <생각>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어떤 수가 이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할 수는 없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다시 제출된다고 하자.
한편 음수(-)나 양수(+)나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먼저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음수나 양수에서는 이런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수가 <이들 조건>을 함께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경우 역시 그런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를 새로 '허수'라고 약속한다.
그러면 결국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다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제출할 내용>이 다시 <있다>고 해야 한다.
불교 논의에서도 이런 문제로 <유무>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체>의 존부 문제도 이런 성격을 갖는다.
어떤 내용이 <다른 것과 구분되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영원>하고 <고정>되고 <불변>한다.
그런 가운데 현재 대하는 <현실>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찾는다.
그런 경우 관념영역에서부터 <이들 조건>을 함께 충족시키는 내용은 세울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관념영역에서 판단하게 된다.
현실에서 잘못된 <망집>을 갖고 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온갖 잘못된 주장을 행한다.
예를 들어 현실 내용이 <참된 진짜 내용> 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실재하는 <실다운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비판하고 깨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논증을 펼치게 된다.
예를 들어 『중론』과 같은 논서 등의 경우다 같다.
<실재>영역에서 <일정한 관념>의 유무 논의도 이런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런 주장이 <관념 영역> 안에서도 <형식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이런 사실을 제시해 그런 주장을 깨뜨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이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 본바탕에 실재한다고 하자.
그런데 한편 그 내용은 또 다른 내용과 <의존하는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을 관념영역에서 세울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어떤 관념>이 이들 두 내용을 함께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관념>을 배척하게 된다.
즉 이 <두 내용>은 서로가 <모순>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만 택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그런 형태의 관념>은 <실재영역>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일정한 내용은 그 주체나 다른 내용과 <상대적 관계>로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 관계>없이는 그 내용을 본래 세울 수 없다.
[ 예: 좌우, 전후, 아버지와 자식]
그런 경우 이는 <그런 관계>를 떠나 <자체적으로 그대로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내용은 <실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처럼 제시해 그런 주장을 깨뜨릴 수도 있다.
결국 <그런 관념이 실재함>을 <귀류논증>형태로 배척하게 된다.
한편, 그 <어떤 내용>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된 결론>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정을 밝혀 잘못된 견해를 깨뜨리게 된다.
다만, 이런 측면의 <유무> 문제는 성격이 다른 <유무> 논의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여부의 유무논의
수학문제가 제출되었다.
그래서 답안지에 <답>을 적어야 한다.
그런데 수학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본래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답>을 적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수학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본래 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이가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답>을 적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와 달리 수학문제를 잘 풀어 <답>을 적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각 경우 <유무>를 다음처럼 문제 삼을 수 있다.
우선 <어떤 내용>이라도 적혀 있는가 없는가 측면에서 <답>의 유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또는 <올바른 답>이 적혀 있는가 측면에서 <답>의 유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경전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로 유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전과 논서에서 여러 어려운 주제가 제시된다.
이 경우 그 주제와 관련해 <가장 적절한 내용>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눈으로 얻는 내용>은 <색>인가.
<색>은 <자신>인가.
<자신>은 사후에 존재하는가.
<실재>는 <색>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제출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에 대해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답 >자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실재>는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의 <분별>을 떠난다.
그래서 실재는 <색>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그에 대한 <답>을 본래 제시하기 곤란하다.
이런 경우 <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어떤 경우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얻는 내용>은 <색>인가가 문제된다고 하자.
이 경우 <좁은 의미의 색>의 개념정의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있다.
그런데 <답>이 있어도 <답>을 몰라 답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 주체에게는 의식에 <올바른 답>이 없는 상태다.
어떤 이가 <색>의 개념을 미리 배우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눈으로 얻는 내용>은 <색>인가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답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한편, 어떤 경우는 <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틀린 답>인 경우도 있다.
그가 <색>의 개념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색이라고 답한다.
그러면 일단 <색>의 개념 정의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틀<린 답>이라고 하게 된다.
이 경우 <올바른 답>은 그 주체의 의식에는 아직 없다.
다만, 이런 측면의 <유무> 문제는 <다른 성격의 유무논의>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과거에 기억한 관념>의 현재 존부문제
과거에 <어떤 이>를 만났다.
그런데 당시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물어본다.
그런데 당시는 분명히 알았다.
그런데 지금 단지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에 대한 관념내용>이 현재 의식에 '없는' 상태다.
또 한편, 어떤 이가 <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또는 무언가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했다.
그런데 그가 <건망증> 환자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엇을 찾는지> 자체를 잊어버렸다.
또 <과거에 배운 내용>을 지금은 잊어 버렸다.
이 경우 이런 <관념내용>은 반드시 <감각현실>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그가 그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배웠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4념처> 내용에 대해 과거에 배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그 구체적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
그런데 나중에 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념처>는 <신ㆍ수ㆍ심ㆍ법>을 말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내용>이 떠오른다.
그런 경우는 그 내용이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있다.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마음의 표면>에는 일단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경우 <그 내용>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경우 그런 내용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게 되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념의 유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일정한 <관념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 <관념>이 지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가를 문제삼을 수 있다.
이런 <유무문제>도 살필 수 있다.
이는 불교에서는 <근본정신>의 유무문제와도 관련된다.
과거에 행한 <업종자>나 <명언 종자>가 <아뢰야식>에 보관된다고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아뢰야식>의 존부 확인문제가 있다.
다만, 이런 측면의 <유무> 문제는 <다른 성격의 유무논의>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연상되어지는 <일정한 관념내용>의 유무
어떤 <관념>을 얻는다.
그러면 이로부터 또 <일정한 관념>을 연상해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후 → 사과는 맛있다 → 맛있는 것은 바나나다 → 바나나는 길다 → 긴 것은 기차다.
이런 식으로 <다른 관념>을 계속 <연상>해 일으킬 수 있다.
또 <감각현실>을 대해서도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경우에 <일정한 관념>을 떠올리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종이에 <일정한 글자>가 쓰여 있다.
그래서 일반인이 정상적인 상태로 대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글자가 가리키는 일정한 의미에 대한 <관념>을 얻는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를 대해 <그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현실에서 생활에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다.
그런 경우 Lakṣaṇa가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다.
그런 경우 이런 글자나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답>을 못한다.
그런 경우 <요구되는 관념>이 <그 주체의 마음>에는 '없는 상태다' [상대적 무]
한편, <일정한 관념>을 연상해 꺼낸다.
그러나 요구되는 내용과 다른 <엉뚱한 내용>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Lakṣaṇa는 한자로 모습[相]이란 의미를 가리킨다.
그런데 '각 주체 서로간'이라는 의미를 꺼낸다.
그러면 원래 갖는 의미와는 <엉뚱한 의미>를 꺼낸 경우가 된다.
그리고 <원래 요구된 의미>는 그 의식에 없는 상태다.
<경전>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관념유무가 문제될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낯선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이들 각 표현은< 일정한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이를 대하는 이가 <이들 표현으로 나타낸 의미>를 잘 꺼내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경전에서 <마음 현상>에 대해 일정한 표현으로 기술한다.
그런데 <마음내용>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하나의 표현이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색이란 표현은 어떤 경우는 <눈으로 얻는 내용>만 가리킨다. (색-안-안식)
그러나 어떤 경우는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의 <감각현실>을 다 가리킨다.(5온의 색)
그래서 각 경우 서로 <의미>가 다르다.
한편, 하나의 표현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다수가 이해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표현이 학술적인 논의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문(文)'이란 글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한 문장>의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불교 논서에서는 이는 <문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글에서 ㄱ ㄴ ㄷ 과 같은 <문자>를 가리킨다. [명ㆍ구ㆍ문]
그래서 서로 착오가 발생한다.
한편, 어떤 이가 일정한 표현으로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표현을 대한 이는 그와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 주체가 이해하는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
한편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어떤 이가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뜻과 달리 <표현>을 잘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한 의미>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각 경우 <각 표현이 원래 나타내고자 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표현을 대할 때 <그런 의미>를 적절히 꺼내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를 잘 이해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각 경우 <그에 적절한 관념>이 일으켜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적정한 관념>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참ㆍ괴, 심ㆍ사, 촉ㆍ수ㆍ상ㆍ행ㆍ식, 변집론, 유변 무변> 이런 식의 한자어도 많다 .
그런데 <참>이 무슨 의미인가,
<참>과 <괴>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심>은 무슨 의미인가.
<심>과 <사>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촉>은 무슨 의미인가.
<촉>과 <수>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변견>의 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편 <변견>의 변과 <유변론>의 변이 같은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답>을 잘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답>을 하더라도 원래 경전과 논서에서 가리키는 의미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각 경우>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측면의 <유무> 문제를 <다른 성격의 유무>논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에 대응한 관념의 존부 문제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 자체를 잘 얻지 못하는 경우
<일정 상황>에서 적절히 일으켜야 하는 <관념>이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런 <관념>의 존부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그런 관념>을 잘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자.
그래서 <요구되는 관념>은 일으키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그 사정이 <감각현실> 영역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안경점에서 <시력>을 검사한다.
어떤 물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한다.
그러려면 일정한 <감각현실>이 일정한 정도로 얻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선, <감각현실> 자체가 잘 얻어지지 않는다.
그 사정이 다양할 수 있다.
<감각현실> 하나를 얻기 위해 여러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무언가가 결여되거나 불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여러 경우가 있다.
우선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또는 <물체>가 크기가 작다.
또는 <물체>가 형체가 쉼 없이 변화하고 뚜렷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기나 안개와 같다.
또는 <물체>가 빨리 이동한다.
또는 <물체>가 무언가에 가려져 있다. 예를 들어 상자에 든 물건과 같다.
또는 <빛>이 어둡다,
또는 <빛>이 산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한다.
또는 <빛>이 반대로 너무 눈부실 경우도 있다.
또는 <눈>에 병이 들었다.
또는 <눈>에 무언가가 가려졌다.
또는 아예 눈꺼풀이 떨려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한다.
그런 경우 <감각현실> 자체가 잘 얻어지지 않는다.
이는 <감각현실>이 아예 얻어지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다.
다만 <일정한 사정>으로 모습이 잘 얻어지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평소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뚜렷하게 <분별>할 수 없는 경우다.
이처럼 <감각현실>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얻어진다.
그래서 그에 대해 <적절한 관념>을 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자판에 <4>라고 글자가 쓰여 있다.
그런데 시력 판의 글씨가 작다.
그리고 그가 눈이 나쁘다.
그리고 시력 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어떤 이가 이런 사정으로 <4>라고 글자를 읽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안경점에서 시력 판에 글씨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곳에 글씨가 있다.
다만 그가 글씨가 희미하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에 대해 <관념>을 일으키기 곤란하다.
그래서 <답>하기 곤란하다.
만일 이 경우 <글씨>가 잘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것이 <4>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이 경우 그 주체의 마음에 그에 대한 <적절한 관념내용>이 '없는' 상태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 자체는 잘 얻는 경우
일정한 <감각현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얻어야 할 <관념>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정한 <감각현실> 자체는 얻었다.
그렇지만, 이후 어떤 이가 일정한 사유로 <그런 관념>을 잘 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식>만 잃은 경우도 있다.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것에 집중해서 파악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한편, 경험이나 필요한 배경 지식, 학습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런 사정들로 적절한 관념을 일으키지 못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로 쓰인 시력 판을 놓고 <시력검사>를 한다.
그리스어 αβ는 알파 베타라고 읽는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 철자>를 배우지 않았다.
이 경우 그 글자 모습은 보인다.
다만 각 글자 형태를 무엇이라고 읽거나 표현할지 모른다.
즉 글자의 <소릿값>이나,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이를 대해 어떤 <요구되는 관념>을 적절히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의식에 그런 <관념>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 그는 그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소릿값>이나 <의미>를 아는 경우가 있다.
<감각현실> 자체를 잘 얻는다.
그리고 그런 감각내용을 대해 일반적으로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어떤 관념>을 일으키는데 학습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그런 지식마저도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을 잘 일으킨다.
예를 들어 α,β란 글자를 보고 알파, 베타라고도 읽는다.
<감각현실>을 대할 때 각 주체의 <관념영역>의 상태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 두 차이를 놓고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감각현실>에 대해 <알고, 모름>의 상태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한편, <감각현실>에 대해 분명하게 내용을 얻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일정한 형태로 <답>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분별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형태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경우에서 가운데에 직선이 그려져 있다.
경우 1 <->
경우 2 >-<
이 두 경우 가운데에, 위치한 직선의 길이는 두 경우가 다 같다.
그런데 느낌상 이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짧다고 여겨진다.
심리학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예로드는 유사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색>은 주변에 어떤 색이 놓이는가에 따라 색 분별에 <착오>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경우 어떤 이가 <감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변 색에 영향 받아 색에 대한 <관념 분별>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다.
또 <감각현실>을 분명하게 얻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a이다 아니다로 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즉, 단순히 <2분법적인 관념분별>을 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입체적이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는 또 달리 꽃으로도 보이는 형태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느 하나만 <답>이라고 하기 곤란하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가 그것이 <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경우 이 주장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런 사정으로 <참>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또 <거짓>이라고도 판단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먹물>을 종이에 흩뿌린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미>로도 보인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이는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단지 먹물을 흩뿌린 것뿐이다.
이 경우도 위와 비슷하다.
한편, 예를 들어 옷감에 <검은 점>과 <흰점>이 섞여 있다.
그런데 그 옷이 흰옷인가 아닌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그 옷이 흰옷<이다>. <아니다>로 답하기 곤란하다.
즉 이다 아니다의 <2분법>만으로는 구분해 답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이 옷은 흰옷이다'라고 진술한다.
이 경우 이를 <참>이라고 하기 곤란하다.
또 <거짓>이라고도 하기 곤란하다.
한편, 피아노 <소리>가 <하얀 색>인가 아닌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피아노소리를 하얀색<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기 곤란하다.
이 경우 <감각현실>도 분명하게 얻었다.
즉, <감각현실> 자체가 얻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분별할 대상내용으로서 <감각현실> 자체는 분명하게 얻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사정상 분별을 행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2분법상의 분별>만으로는 분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분별 과정에 이런 사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구 분별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분별한다.
a<이다>.
a가 <아니다>.
a<이기도 하고> a<아니기도 하다>.
a<도 아니고> a<아닌 것도 아니다>.
<유무> 문제도 마찬가지다.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4구 분별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추론체계>도 같이 문제된다.
추론체계가 <참>과 <거짓>으로만 2분되어 처리되는 체계라고 하자.
그런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추론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 <참, 거짓> 만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이런 측면의 유무> 문제를 <다른 성격>의 <유무>논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어떤 이가 일정한 <관념>을 일으키고 있는가 여부의 문제다.
즉, 일정한 <감각현실>을 대해 <요구되는 일정한 관념>을 일으켜 얻어 내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다음 <유무> 논의와는 측면이 다르다.
즉, <일정한 관념>이 <감각현실> 영역에 있는가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 7실재 영역>에 <일정한 관념>이 그대로 있는가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Table of Contents
▣- <언어 영역>에서 <언어>의 유무 문제
언어표현은 <감각현실> 형태로 일정한 <글자모양>이나 <소리>를 주로 사용한다.
어떤 주체가 일정한 <글자모양>을 대한다.
그런 경우 그에 대해 <1차적>으로 <관념분별>을 일으킨다.
이는 마치 <바위 모습>을 보는 경우와 같다.
이제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 바위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본다.
이 경우 직전에 본 <감각현실>을 직접 떠올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관념영역에서 <대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에 <선>으로 그려 보는 <대강의 모습>과 같다.
그런데 이들은 <관념적 내용>이다.
현실에서 <언어>인 <글자모습>을 대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 <글자 자체의 모습>에 대한 관념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한편 <말소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 그 <소리 자체>에 대해 <1차적>으로 <관념분별>을 일으킨다.
이 경우도 <물소리>를 듣는 경우와 같다.
<귀>를 닫고 소리를 듣지 않는 상태라고 하자.
이 경우 <그 직전의 소리>를 그대로 다시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의 관념영역에서 직전에 들은 소리를 <대강>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글자모양>이나 <소리>를 대해 일으키는 <관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꽃'이란 글자 형태>를 떠올린다.
또는 <귀>를 닫고 소리를 듣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으로 <'kkot 이란 말소리'>를 떠올린다.
이런 경우 <마음에서 떠올려지는 관념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언어>는 다시 <다른 일정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일정한 <감각현실>과 <관념내용>이 <언어>로 평가받는다.
일정한 <감각현실>과 <관념내용>이 언어로 되는 것은 이런 사정에서다.
한편 이런 <언어가 가리키는 영역>은 제한이 없다.
언어는 각 <감각현실>의 각 부분을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언어는 <어떤 느낌>을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언어는 <관념분별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언어적 <언어 표현 그 자체>[단어, 철자]를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언어는 <본바탕의 실재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언어는 그 존부가 문제되는 <참된 진짜 실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에 모두 <언어>가 사용된다.
그것은 언어가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꽃'이란 글자형태>나
이런 언어가 <가리킬 수 있는 내용>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이런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를 들어 그것은 화분에 있는 <장미꽃 모습>일 수 있다.
한편,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는 꽃에 대한 <관념>도 있다.
한편 본바탕인 <실재>도 있다.
이는 주체와 관계없이 본래 있다고 할 본바탕 내용이다.
이런 <실재>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래서 자신이 얻는 <감각현실>과 관련된 <실재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참된 진짜로서 뼈대가 되는 <실체>의 존재도 추리하게 된다.
그리고 언어는 이들 <여러 차원의 내용>들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논의할 때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주체가 이들 내용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이는 <언어가 갖는 이런 기능>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는 <언어 차원>의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다음 경우들과 같다.
"<꽃>이란 <한글 단어>는 <영어>의
그리고 이는 <불어> fleur에 해당한다.
또 <독일어> die Blume에 해당한다.
또 <일본어> はな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자> 花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각 <언어표현>이 <언어차원의 내용>을 가리키 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편 어떤 것의 '<유무>'를 <언어 차원>에서 문제 삼을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는 <관념분별> 측면에서 <유무>를 살피는 경우와 같은 문제를 갖는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그런 <언어 측면>에서만은 '있다'고 해야한다.
예를 들어 '라라꾸'라는 생소한 <언어표현>을 누군가가 한다고 하자.
이 경우 그 포현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자.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 단지 <언어측면>에서 그 언어 표현의 <유무>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단 <그런 글자>는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그런 <언어표현> 자체는 <있다>고 해야한다..
한편 이런 경우 그런 <글자형태>를 대해 1 차적 <관념분별>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언어관념은 일단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결국 <이런 측면의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쓸모없는 <희론>이 된다.
다만, <언어학>적으로는 다음 측면에서 여전히 이들 주제가 문제될 수 있다.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일정한 언어 표현>은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언어>의 <본질>과 <효용>은 이 부분에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라라꾸'라는 표현이 과연 현실에서 가리키는 <어떤내용>이 있는가 여부를 놓고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한편, 어떤 언어 표현이 특정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인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kkot 이란 단어를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인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는 그런 kkot 이란 단어가 <영어사전에 올려져 있는가>여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한편, blue란 단어가 영어에 사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 그런 blue 란 단어가 영어권에서 '활기참'이란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가 여부를 놓고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들은 <언어학적인 논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측면의 <유무> 문제를 <다른 성격의 유무논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관념영역>에서나 <언어 차원>에서의 유무는 보통 문제 삼지 않는다.
[일정내용 자체 영역 유무판단]
<생사고>통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무언가의 <유무>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런 측면의 <유무>는 <주된 초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언어표현>이 <일정한 의미>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 언어표현이 <일정한 의미>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 <일정한 의미>가 <일정한 언어표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경우 <그런 의미>가 <그런 언어표현>에 본래 <들어 있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그리고 이들 유무 논의는 앞과는 다른 성격이 된다.
그런 경우 <언어표현>에 <그런 의미>가 본래 들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언어표현>은 <일정한 의미>를 그처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 약속일뿐이다.
한편, 그런 <언어표현>은 곧 <그런 의미> 자체인가 여부도 문제 삼을 수 있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 내용과의 정체판단.-이다,아니다 사실판단]
이 경우도 <언어표현>이 곧 <그런 의미> 자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여하튼 이처럼 각 논의에서 <논의 성격>을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언어 시설>의 문제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다.
이런 경우 각 경우마다 그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
우선 <일반 현실>에서 행하는 <유무판단>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방>에 <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 삼는다.
이런 경우 먼저 <관념영역>에서 <꽃에 대한 관념>을 떠올린다.
그리고 <빛>이 밝은 상황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 상황에서 <일정 부분>을 대해 <꽃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꽃>이 거기에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상황이 이와 <다른 경우>가 있다.
<눈>을 뜬다.
그 상황에서 <다른 것>은 보인다.
그렇지만, <꽃이라고 여길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꽃>은 '없다'고 표현한다.
현실에서는 주로 <이런 측면>에서 <유무 판단>을 행한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무언가가 <보이거나> <대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꽃>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일정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이는 그가 그 <감각현실> 부분이 그런 <관념 내용>'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망상분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유무판단>은 바로 이런 바탕에서 행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정한 관념>[想]을 바탕으로 <상>(相 Lakṣaṇa)을 취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정한 상>(相)을 찾아나가는 바탕에 있다.
그런데 <언어표현>을 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방에 <꽃>이 있다'고 언어로 표현한다.
이 경우 그 표현이 위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그와 같다.
그런데 한편, 이와는 <다른 경우>도 있다.
즉 <일정한 언어표현>이 단지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전에서 <생사현실>을 설명한다고 하자.
이 경우 상대는 <망집>에 바탕해 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그런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정한 언어>를 시설해 설명하게 된다.
이 경우 그런 <언어 시설>은 이런 내용을 <그처럼 '가리키기' 위한 방편>이다. [시설施設ㆍ안립安立ㆍ가명假名]
예를 들어 <감각현실> 내용을 예를 들어 <색>이라고 칭한다고 하자.
이는 언어표현은 그처럼 일정한 <감각현실> 들을 가리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이는 <그런 관념내용>이 <감각현실>에 그처럼 '<있다'>라고 제시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는 일정한 <감각현실> 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다'>라고 제시함도 아니다.
단지 그런 언어를 통해 그런 <감각현실> 부분을 <그처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다양한 차원의 내용>을 각기 가리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각현실> <일정부분>만 가리킬 수도 있다.
또는 <본바탕 실재>를 가리킬 수도 있다.
기타 <관념적 내용>이나, <언어 차원의 내용>이나, <실체적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언어방편>은 <일정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 내용>을 가리키기 위해 <언어표현>을 시설해 사용한다.
이런 경우 그 언어는 원칙적으로는 이처럼 <일정한 내용>을 <가리킴>으로만 이해하고 그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를 넘어서, <일정 부분>에 그런 <관념>이나 <언어내용>이 '있다'고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두 내용은 서로 다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꽃>이 <있다>'고 표현했다.
그 경우 이 표현은 그가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즉, <꽃이란 언어>가 <가리키는> 일정한 <감각현실>이 있다.
그런 <감각현실>을 <얻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고 하자.
어떤 이가 <꽃에 대해 관념>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그는 <일정부분>을 그런 꽃이라고 가리킨다.
그래서 거기에 '<꽃>이 <있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고 하자.
즉, 그런 <감각현실>에 <그런 관념내용>이 그처럼 <들어 있다>.
또 <감각현실> 일정부분이 곧 <그런 관념>이나 <언어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잘못>이 된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은 서로 <다른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들을 잘 구분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언어 시설로 <감각현실> 부분을 가리키는 경우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가리키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가리키기' 위해 <언어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경우 <어떤 표현 A>가 적절하게 대응해 가리키는 <감각현실>이 있다.
예를 들어 '<바위모습' 이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자.
그런데 현재 <바위 모습>에 해당하는 일정한 '<감각현실>'이 얻어진다.
그러면 지금 <바위모습>이 보인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 바<위모습>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결국 <그런 감각내용>이 그렇게 <얻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경우 바위라는 <'관념'>이 그 <감각현실> 부분에 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경우>의 구체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 사정을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언어표현>만으로는 이 각 경우를 구분하기 힘들다.
즉 바위라는 <언어표현>이 있다고 하자.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리킨 것인가를 표현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이 <표현>은 각 경우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셔 <관념 내용>이나, <실재>, <실체>, <언어표현>, <감각현실> 자체를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순히 <순수한 감각현실> 부분으로서 <바위>를 가리킬 경우도 있다.
그리고 <관념과 접착된 감각현실>로서 <바위모습>[상相]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는 <감각현실과 접착된 형태의 관념>으로서 바위를 의미할 경우도 있다.
또는<단순히 바위에 대한 관념>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각 경우를 <표현>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
이는 결국 <전체 맥락>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법처소섭색>[감각할 가능성으로서 유무판단]
<언어표현>이 일정한 <감각현실>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자.
예를 들어 '<바위>가 저기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 경우 <바위> 모습이라고 여기게 되 일정한 '<감각현실>'이 현재 얻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단순히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바위라는 '<관념'>이 그 <감각현실> 부분에 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감각현실>에 대해 <언어>를 시설해 가리킬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감각현실>의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들을 <언어>로 시설해 나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도 다시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다.
<일정한 내용>을 지금 당장은 감각하지 못한다.
즉, <감각현실>을 직접 얻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정한 내용을 감각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현재>는 <그 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내용이 단순히 <잠재>한 상태다.
그런데 이를 <일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제시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순전히 관념영역 안의 <관념내용>도 아니다.
그리고 <감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리킨 것도 아니다.
이는 <감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다만 <당장 얻는 감각내용>을 가리키는 내용은 아니다.
이 경우 <있음>이란 다만 그것을 감각해 대할 수 있는 <다른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관념영역에서 <그 가능성>을 분별해 이를 표현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유무문제는 조금 모호한 중간 영역에 놓인다.
이런 경우 이들은 제6의식이 얻어내는 <법처에 포함되는 색8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법처 소섭색>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그런 사정으로 여하튼 현실에서 그런 내용의 유무도 문제된다.
따라서 유무 논의에서는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
극략색(極略色)ㆍ
극형색(極逈色)ㆍ
수소인색(受所引色 무표색)ㆍ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ㆍ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 등]
이들 내용을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극략색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잘게 갈아 나눈다고 하자.
또는 오늘날 <현미경>을 통해 사물을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아주 작은 입자>를 대하게 된다.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대한다.
그 상황에서 <작은 입자>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상황에 앞과 같이 잘게 나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더 작은 입자>를 대하게 되리라 추리한다.
또는 <현미경>으로 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보게 될 <작은 입자>가 있으리라 추리하게 된다.
현실에서 이처럼 어떤 사물의 <극미>나 <원소>의 존부를 문제 삼는다.
이를 비유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멀리서 산의 <숲 모습>만 본다.
그리고 정작 <나무>는 낱낱이 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나무>가 있다고 할 것인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입장 따라 <유무 판단>을 달리하게 된다.
이 때 <나무>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자.
이는 다음 의미다.
지금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다.
즉 직접 산에 가까이 <다가가서> 대한다.
또는 <망원경>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분명 <나무>를 볼 수 있다.
또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리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극미> 등의 <존부>문제는 이런 경우와 성격이 같다.
[極略色극략색, 極微극미]
♥Table of Contents
▣- 극형색
한편 평소 <허공>이라고 여기고 대하는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밀폐된 공간에 <어떤 공기>를 주입한다고 하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느낄 수 있다.
또는 <질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게 된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질소>나 <수소>나 <헬륨> 등등이 그런 경우다.
그런 가운데 <허공의 명암>이나 <빛 그림자>를 대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를 미세하게 <극미>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추리하는 것이다
그런 미세한 것이 있다.
때문에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추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별을 나타내게 하는 미세한 <재료>를 추리한다.
그리고 그것의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極逈色극형색]
♥Table of Contents
▣- <수소인색>
한편 어떤 이가 평소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턱걸이를 <100회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그의 신체>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상태>가 되었다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와 철봉 앞에서 실험을 해본다.
그러면 그 예측대로 <차이>를 보게 된다.
이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무언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관상은 <그런 내용>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외관>만 놓고 살피면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해야 한다.[無表]
그렇지만,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무언가의 내용>이 이 상태에 <잠재>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경우는 또 <그런 내용>이 그처럼 <있다>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계율>을 지켜 익힌다.
그러면 <어느 단계> 이후는 <그의 상태>가 달라진다.
어떤 상황이 일반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상황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도 그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탐욕>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서도 그는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런 수행자는 일반인과 달리 <무언가>를 갖추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상태는 5계 8계 등 계를 <받아서[受] 끌어내진[所引] 색[色]>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수소인색>이라고도 한다.
[受所引色수소인색, 無表色무표색]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무언가가 '있고 없음'을 문제 삼을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변계소기색 >
한편 <일정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현실을 대한다.
그런 경우 그런 생각으로 그 현실을 달리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솥>으로 여기고 대한다.
그런데 그가 거북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거북이>를 생각하는 중이다. [遍計]
그런 경우는 <솥뚜껑>을 대하며 <거북> 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所起色]
그리고 놀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의 경우와 달리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거울에 <어떤 꽃>이 비추이고 있다.
또는 물에 <꽃>이 비추인다.
그것은 물론 <직접 대하는 꽃>과 다르다.
그러나 여하튼 <거울> 자체나 <물> 자체와는 다르다.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또 이런 경우는 <바위가 비추이는 거울>과는 다르다.
또 <바위가 비추이는 물>의 상태와도 다르다.
따라서 이 경우 그렇게 달리 파악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추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거기에 있다고 여기게 된다.
이런 경우 그런 <반응>을 하게 하는 <무엇>의 유무를 문제삼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Table of Contents
▣- <자재소생색>
한편 <정려 수행> 중에서 경험하는 <특수 현상>이 있다.
또 정려 수행에서는 그 힘으로 변화시켜 일으키는 <색성향미촉>이 있음을 제시한다.[自在所生色자재소생색]
그런 경우 <이런 내용>의 <정체>와 <그 유무>도 문제된다.
다만 <정려 수행>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일반적 입장에서 이를 함께 살피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최면>은 비교적 일반인도 종종 경험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어떤 <최면술사>가 최면에 걸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댄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뜨거운 물>이라고 최면을 걸었다.
이런 경우 상대는 손에 <수포>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포는 <화상>을 입을 때 나타난다.
또는 혁대를 <뱀>이라고 최면에 걸었다고 하자.
그러면 상대는 이를 대하면서 <소름>이 돋을 수 있다.
또는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현실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를 대하는 주체>의 입장을 고려해 살펴보자.
이 경우 여하튼 <일반적인 상태>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는 <무언가>로 인해 그렇게 된다고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주체와 관련해서는 그런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는 <무언가 내용>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있고 없음>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낳는 <그 무엇>을 달리 가리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정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정려 수행>중의 <자재소생색>도 이에 준해 생각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유무판단문제
이미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으로 여러 내용을 살폈다.
극략색(極略色)ㆍ극형색(極逈色)ㆍ수소인색(受所引色)ㆍ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ㆍ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 등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시 여러 경우를 나열할 수 있다.
지금은 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차 <감각현실>을 얻는 <관계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자.
그러면 <감각해 얻게 될 내용>이 있다.
즉, 상황이 달라지면 일정한 내용을 <감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 내용>의 유무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러나 이 경우 그 내용을 지금 <얻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지 그 내용을 <감각할 가능성>의 <유무>만으로 '있고 없음'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히 관념영역에서 <관념분별 내용>의 <유무>를 살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6의식이 얻는 <법처>에 포함되는 색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예로 다음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자 속에 어떤 <과일>이 들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상자>를 닫아서 다시 열수 없다.
한편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상자에 <과일>이 계속 있다고 할 것인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리고 이런 경우 <유무판단>을 한다고 하자.
이는 그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당장 직접 감각해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있다'고 표현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있고 없음'을 표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한편, 이는 본바탕이 되는 <실재영역>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실재>는 처음부터 현실 내용을 얻는 <주관>과의 관계를 떠난다.
그런 가운데 <본바탕>의 내용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기 <직전>에 상자를 보았다.
그런데 <눈>을 감고 그 <상자>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나 없나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이는 <주관과의 관계>를 일체 떠난 무엇[실재]를 찾는 경우는 아니다.
이 경우는 다시 <눈>을 뜨면 보게 될 내용[현실내용]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들로 다음과 같은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내부 내용>
예를 들어 <벽>이 있다.
이 경우 <벽> 안에 <흙>이 있는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Table of Contents
▣- <장애물>로 가려진 내용
한편, 벽이 있다고 할 때 또 <벽>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와 비슷하다.
♥Table of Contents
▣- <먼 곳의 내용>
한편 깊은 <산>속에 지내는 이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바다>는 산 너머 멀리 있다.
그래서 그가 바다를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 <산 너머>에 <바다>가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한편, 현실에서 자신이 끝내 가보지 못할 <아주 먼 어떤 곳>이 있다.
그런 곳에 자신이 평소 보지 못한 <이상한 동식물>이 있다.
이를 보고 온 <다른 이>가 이를 <자신>에게 보고한다.
예를 들어 기자가 현지에 가서 특이한 동물의 <사진>을 찍어 왔다.
또는 학자가 어떤 내용을 <글>로만 적어 보고한다.
그런 경우 그것이 정말 그처럼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그런 내용만으로 그 <있고 없음>을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감각에 필요한 요소 조건> 등이 <결여>된 기타 여러 상황
<어두운 방>에서 <불>이 꺼졌다.
그러면 보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직전에 본 사과>가 그대로 있는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한편 어떤 이가 <묶여 있다>.
그 상태에서 <눈>을 떠 세상을 본다.
그런데 자신의 <눈썹>과 <이마>나 <허리> 등은 보지 못한다.
그 상황에서 <그런 모습>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 <거울>을 통해서 이를 볼 수 있다.
또 나중에 <손>이 풀리면 만질 수도 있다.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그것을 감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튼 어떤 사정으로든 현재 직접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를 <있다거나 없다>고 표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어떤 측면에서 <유무>를 표현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감각현실>
현실에 다음 문제도 있다.
<장님>에게 <노란 색>을 말한다.
이 경우 <장님입장>에서 이것을 <있다>고 해야 할 지가 모호해진다.
또 <귀>가 안 들리는 이가 있다.
이런 이 입장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있는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주체는 상대적으로 <그런 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감각하고 얻는다.
이런 경우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유무>를 판단할 지가 애매해진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생명체>의 <다른 감관>이 얻는 내용들
예를 들어, <개>는 <특정한 냄새>를 맡는다.
그러나 사람은 못 맡는다.
한편, <코끼리>는 <특정한 대역대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사람은 못 듣는다.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의 <있고 없음>의 판단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도 같은 성격의 문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기계적 센서>를 통해 얻어지는 내용
요즘 과학기계가 발달했다.
그래서 <적외선>이나 <자외선>, <기타 X선>, <초음파 > 이런 측정 장치가 있다.
그래서 <영상>을 얻기도 한다.
그리고 그 때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도 <기준>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없다'.
그러나 <다른 측정수단>을 동원하면 파악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주체가 <기계 상태>로 직접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 기계는 직접 <어떤 상태>를 얻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을 통한 <6신통> 등
수행자가 갖추는 신통에 대한 내용이 경전에서 제시된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시간 공간의 장애>나 <감관> 등의 문제로 얻지 못한다.
그런데 수행자가 <그런 내용>들을 <감각>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반적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없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경전에 수행을 통해 <6신통>을 증득한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한편 부처님이 되면 <5안>을 갖추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5안은 <불안ㆍ법안ㆍ혜안ㆍ천안ㆍ육안>을 말한다.
또 예를 들어 부처님이 경전에서 <3계 6도>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옥>이나 <아귀>, <하늘> 등을 제시한다.
이 경우 <지옥>과 <지옥 중생>이 있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는 <아귀세계>와 <아귀 중생>이 있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런 성격의 내용을 제시한다.
이 경우 각 주체가 <그런 세계>에 <그런 중생 상태>에 처한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는 내용처럼 경험하게끔 되는 내용이다.
즉, 경전에서 그런 성격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경우 이는 현실에서 <기자가 행하는 보고>와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직접 <감각>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직접 얻지 못한다.
따라서 그 <유무>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감각할 수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현재는 그런 내용을 얻는데 필요한 일부 <요소>가 결여된 상태다.
그래서 <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그 내용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다.
♥Table of Contents
▣- <공간>의 유무문제
<공간>은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데 <공간>의 <크기>나 <유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하늘 위에서< 점>으로 보이는 공간이 보인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옆에 놓인 <의자>는 이 <점>보다 대단히 커 보인다.
그런데 그 작은 <점> 부분이 알고 보면 <하나의 도시>일 수 있다.
<공간>은 일정한 <기준 사물>을 가지고 <크기>를 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이 되는 사물>을 넣고 빼고 한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간>이 그만큼 <있다>거나 <없다>고 여긴다.
이 경우 <공간의 크기>를 재는 <기준 사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간의 <유무>나 <크기> 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
<공간>은 일반적으로 <생ㆍ주ㆍ멸 변화>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상대적 관계>를 통해 공간의 <유무>나 <크기> 여부를 달리 문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느 공간에 <어떤 사물>을 넣어보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에 아무리 <10톤 트럭>을 넣어보려도 들어갈 공간은 없다.
그러나 <산소 10톤 분량>은 이상하게 들어간다.
이런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공간의 크기>를 재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공간의 <유무>나 <크기>의 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상대적>인 차이다.
다만 문제 삼는 <공간>을 직접 감각하기는 곤란하다.
현실에서 <감각하는 다른 내용>들을 근거로 그 <유무>나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은 결국 <감각현실과 관련>된 <유무 판단> 성격을 갖는다.
♥Table of Contents
▣- <마음>의 유무
불교 내 유무 논의에서 단순한 <관념>의 존부 문제는 논의 초점이 아니다.
그런데 <마음>의 <존부> 문제를 살핀다고 하자 .
이런 경우 <단순한 관념>의 존부 문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우선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경전에서 제시한다.
이 경우 어떤 이가 그런 <마음>을 단지 생각해 낸다고 하자.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마음>의 유무도 <단순한 관념>의 존부문제로 논의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마음>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Table of Contents
▣- <마음>의 시설
<마음>의 존부문제는 다음 성격을 갖는다.
우선 현실에서 다음의 관계를 밝힌다.
현실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현실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관계>가 현실에서 밝혀진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시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렇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는 단지 <사변적>으로 즉 <생각만으로 만들어 내는 관념>은 아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아래에서는 <마음>을 있다고 시설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눈>을 통해 사물을 본다.
그러나 <눈>이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
<마음>도 성격이 비슷하다.
<마음>은 현실에서 한 주체가 얻는 <일체 내용>을 얻는데 작용한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대해서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 <마음현상>으로 이해하는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떠 모습을 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작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마음>은 굳이 없어도 보는 데 지장이 없는가가 문제된다.
<마음>의 <있고 없음>의 문제는 이런 성격의 논의다.
경전에서 <마음>을 시설해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시한다.
물론 그 마음을 일반적인 경우처럼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렇지만,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이 있다고 <시설>해 제시하게 된다.
[참고 ▣-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의 시설 문제 ]
현실에서 <마음현상>으로 이해하는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떠 모습을 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물질간의 작용 변화관계>로만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현실에서 <물리적인 작용 관계>로 파악하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파장이 호숫가에 가 닿게 된다.
또는 <도미노>를 세워 놓고 한쪽에서 쓰러뜨린다.
그러면 연달아 쓰러져 끝 부분이 쓰러진다.
이들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 현상>처럼 마음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오늘날 <생리학자>들은 마음현상을 이런 <물리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외부 물질>이 있다.
그리고 한 주체의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들 간에 <작용~반작용>, <자극~반응> 이런 운동 변화관계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마음현상은 <이런 현상>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날 <생리학자>들은 주로 이런 형태로 마음현상을 이해한다.
이 가운데 어떤 입장이 옳은가.
<불교 경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음>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제시한다.
<마음>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 내용>을 얻는다.
즉, <마음 현상>이란 <마음>을 전제로 해서 얻는다.
현실에서 얻는 <일체 내용>은 <마음>이 별도로 존재함을 <전제>해야만 한다.
현실에서 <생리학자>들이 물질로 판단하는 각 <현실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도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얻는 내용이다.
현실에서 <생리학자>들이 <물질>로 판단하는 그런 각 <현실 내용>들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물체>나 <빛> 그리고 <눈>이 관계해, 내부물질인 육체기관으로서 <뇌>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자.
그런데 이렇게 <생리학자가 관찰한 내용들> 자체가 <그 생리학자가 얻어낸 내용>이다.
즉 이는 <생리학자>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안 내용>이다.
즉 이는 <생리학자>의 마음이 관계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런데 그처럼 <생리학자가 얻어낸 내>용으로 다른 이들의 < 마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잘못 이해한다.
이는 관계를 거꾸로 뒤집혀 행한 <잘못된 판단>이 된다.
[참고 ▣- 생리학자의 입장이 잘못인 사정 ]
♥Table of Contents
▣- <마음>의 실다움과 <다른 영역>과의 관계
<유무> 논의에서 각 논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혼동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각 유무 논의에서 <논의 성격>을 먼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일정한 사정으로 <있다>고 시설한다.
이를 없다고 할 경우 현실 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참된 실체>를 갖는가도 문제된다.
이 경우 마음의 <참된 실체>도 역시 없다고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다음을 논의할 수 있다.
한편 그런 마음이 '<실재 영역>에도' 그런 형태로 있는가를 문제삼을 수 있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실재 영역은 본래 유무를 분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재 영역>에서 마음의 유무도 사정이 같다.
<실재 영역>에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정으로 <마음>도 참된 <실다운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마음>과 <본바탕 실재>를 서로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이를 아래에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마음>과 <실재>의 혼동과 구분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마음>은 한 주체가 그런 <현실 내용>을 얻어내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직접 보거나 얻지 못한다.
그런데 실재도 현실의 <본바탕>이다.
한 주체의 <관계>를 떠나서도 <그대로 있다고 할 본바탕 내용>이다.
또 이는 한 주체의 <관계>를 떠난 내용인 사정으로 이를 한 주체가 끝내 얻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마음과 <공통점>이 있다.
우선 한 주체가 그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하는 점>이 같다.
그리고 이를 각기 현실내용의 <바탕>으로 보는 점이 같다.
그래서 <마음>과 <실재>를 서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얻는 내용>을 준거로 한다.
그리고 마음은 이런 <현실 내용>을 얻는데 기능한다.
반면 실재는 그런 <마음>과 관계없이 그대로 있다고 할 <본바탕의 내용>을 가리킨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 얻는 내용>들을 떠난다.
또 그런 <마음>도 떠나게 된다.
이를 <그릇>으로 비유해보자.
그런 <현실 내용을 얻는 그릇>과 같은 것을 <마음>으로 표현해 가리킨다.
그런데 <실재>는 <그런 그릇>을 떠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을 가리킨다.
결국 <마음>을 기준으로 살핀다고 하자.
이 때 <마음 안에 얻어진 내용>이 <현실 내용>이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런 현실내용>을 바탕으로 시설하게 된다.
반대로 <실재>는 <그런 마음>을 떠난 <본 바탕 내용>이다.
즉 <마음>과의 관계를 떠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을 가리킨다.
그래서 <현실내용>과 <실재>의 경계선에 <마음>이 위치한다. [심진여문心眞如門 심생멸문心生滅門]
<실재>와 <마음>은 이처럼 서로 구분된다.
♥Table of Contents
▣- <언어표현>에서의 혼동 정리
이상 다양한 유무 논의를 살폈다.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현실에서 일정한 <언어표현>을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언어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각 경우 <그 언어표현으로 가리킨 각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음>의 존부를 문제 삼는다.
이 경우는 오로지 관념영역에서 일으킨 <관념>의 존부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언어표현을 <언어표현> 영역에서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직접 감각하여 보고 만지는 어떤 <감각현실>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또는 주체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실재하는 <본바탕 내용>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진짜라고 할 <실체>의 존부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현실에서 <감각현실>이나 <관념>을 얻는다.
이런 경우 이를 통해 이를 얻게 하는 <마음>을 전혀 없다고 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언어>로 그런 내용을 일정하게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있고 없음>을 문제 삼게 된다.
그래서 언어가 각기 가리키는 <차원이나 측면>이 각기 다르다.
<언어표현>만으로는 이들 각 측면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체 내용>과의 관계를 통해 <맥락>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각 언어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유무>논의 시에는 이런 기본 사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한편 <언어로 내용을 표현하는 이>도 이런 점에 함께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각 언어표현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바>를 상대가 되도록 <혼동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있고 없음>의 판단에서 <각 영역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형식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유무>문제를 나열해 살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관념영역>에서 살필 <주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는 살피려는 문제 내용이다.
이들 문제 일체는 분별을 행하는 <관념영역>에서 살핀다.
그래서 일단 살필 주제는 관념형태가 된다.
그러나 <그 관념>은 <언어 관념>의 가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관념>은 다시 살피고자 하는 <일정영역의 무언가>를 가리킨다.
그것은 예를 들어 <감각현실> 내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언어>나, <관념내용>, 또는 <실재>, <실체 >등일 수도 있다.
여하튼 이를 관념영역에서 예를 들어
그리고 <그렇게 가리킨 내용>의 <유무>를 문제 삼게 된다.
<언어표현>은 <각 영역>의 <각기 다른 내용>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언어표현> 자체만으로는 쉽게 이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래서 논의에서는 <각 언어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전체적 내용과의 맥락>을 통해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유무> 문제는 <그 성격>을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즉,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유무판단]과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이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유무판단]은 다음과 같은 유무판단이다.
예를 들어 <관념>이 <관념영역>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측면이다.
또는 <감각현실>이 <감각영역>에서 그처럼 얻어지는가 여부를 살피는 측면이다.
그러나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무판단이다.
예를 들어 <관념>이 '<감각현실>' 영역에도 그처럼 그대로 있는가여부를 살핀다.
또는 <관념>이 '<실재 영역>'에도 그처럼 그대로 있는가여부를 살핀다.
또는 <감각현실>이 <관념영역>에도 그처럼 그대로 있는가여부를 살핀다.
또는 <감각현실>이 <실재 영역>에도 그처럼 그대로 있는가여부를 살핀다.
이는 <이들 각 내용>이 꿈과 달리, <실다운 내용>인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즉, 현실 내용이 <집착>을 가질만한 <실다운 내용>인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현실에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무>논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초점을 두게 된다.
한편 각 <유무>논의에서 이들 각 <논의 성격>을 잘 구분해야 한다.
<있고 없음>의 문제를 살핀다.
이 경우 가장 <기본적인 유무판단>은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유무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유무 분별 자체>는 일단 <관념>영역에서 행한다.
즉,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등은 모두 그 자체가 <관념 분별내용>이다.
이런 사정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관념영역>을 벗어난다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실재>나 <감각현실>의 영역을 놓고 살핀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 영역에서는 이들 <관념내용> 자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있고 없음의 분별>을 모두 떠나야 한다.
<그런 분별 내용>이 <이런 영역>에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의 사정이 이와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어표현>은 이들 각 내용을 일단 <가리키게 된다>.
그리고 또 <분별>도 그에 대해 여전히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예를 들어 눈을 떠서 <일정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 경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분별>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일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눈>을 떠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언어표현>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정한 모습>이 '있다'거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감각영역>에서 단순히 <그런 감각내용이 얻어짐>을 나타낸다.
[일정내용 자체 영역 유무판단]
물론 <감각현실> 영역에서 <관념분별>은 얻을 수 없다.
또한 <감각현실> 영역에 본래 <유무판단과 같은 분별>은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관념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언어적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일정한 언어표현>을 행한다.
그런 경우 이 표현을 대하는 가운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 위 표현을 다른 성격의 유무판단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즉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감각현실> 영역에 <그런 분별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감각현실> 영역에 <그런 언어표현>이 그렇게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서로 구분해야 한다.
이 경우 <언어 자체>ㆍ<언어가 가리키는 관념내용>ㆍ<언어가 가리키는 감각현실내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에서 이들을 서로 잘 구분해 파악해야 한다.
<실재>에 대한 분별을 행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재>는 그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언어표현>으로 실재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런 <언어표현이 가리키는 영역>을 살핀다.
그러나 한 주체는 이런 <실재>를 직접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런 <실재>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한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내용 A>가 있다.
그래서 <그 A>가 <실재 영역>에 그처럼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실재>는 <공>하다.
<현실내용 A>는 <실재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언어>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언어표현>을 대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언어표현>에서 <각 언어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을 잘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실재>라는 언어 표현은 언어표현상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표현 영역>에서 <그런 언어표현> 자체는 그렇게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한편, 이 경우 <그런 언어표현이 가리키는 일정한 관념내용>도 있을 수 있다.
<실재라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이런 표현으로 마음에서 떠올리는 <일정한 관념분별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그런데 또 한편, <그런 언어표현으로 본래 가리키고자 한> <본바탕 실재>가 있다.
그 경우도 <본바탕 실재>는 본래 그처럼 여여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정내용의 <자체 영역> 내 유무판단]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은 <서로 다른 측면>이다.
한편 무언가가 <실다운 내용>인가를 판단하려 한다.
이 경우는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이들 각 내용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한 내용>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있는가를 초점으로 한다.
그래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각 내용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자신이 문제 삼는 <관념분별 내용 A>가 있다.
그런데 먼저 그런 내용이 <감각현실>에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그래서 <감각현실> ~ <관념분별>의 상호관계를 살핀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해야 한다.
먼저 <감각현실> 그 자체가 곧 <관념분별 A> 인가를 살펴야 한다.
또 반대로 <관념분별 A> 그 자체가 곧 그 <감각현실>인가를 살펴야 한다.
이 <두 판단>은 서로 같은 방식의 판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모두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이 모두 <경찰>은 아니다.
따라서 <주어>를 각기 바꿔 그 관계를 각기 살필 필요가 있다.
한편, <감각현실 영역>에 <그런 관념분별>이 그처럼 얻어지는가를 살펴야 한다.
또 <관념분별 영역>에 <그런 감각현실>이 그처럼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물론 이 각 경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들 <각 내용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잘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시 다음을 살펴야 한다.
그러한 <관념분별 A>는 그런 <감각현실>을 완전히 떠나 얻는가.
즉, <관념분별>은 <감각현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홀로 얻게 된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전혀 무관한가>를 살펴야 한다.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바탕으로 <관념>을 일으킨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이들은 <전혀 무관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감각현실>과 <실재>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또 <관념분별>과 <감각현실>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관념분별>과 <실재>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음>과 <실재>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마음>과 <그 마음에 얻어진 내용>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즉, <마음>과 <감각현실>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마음>과 <관념분별내용>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꿈>과 <현실>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거울>이나 <거울에 나타난 모습>의 관계를 살필 때도 이 형식은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방식을 통해 <각 영역의 내용의 상호관계>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수행>에서는 다음 부분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각 내용>이 <집착을 가질만한 실다운 내용>인가.
꿈과는 다른 <실다운 내용>인가.
이런 측면에서 <유무논의>를 행한다.
<꿈> 내용은 <현실 영역>에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꿈이 실답지 않다>고 하게 된다.
그래서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에 초점이 주어진다.
그런 경우 <각 영역의 관계>를 위와 같이 먼저 잘 판단한다.
그런 가운데 살펴나가야 한다.
◧◧◧ para-end-return ◧◧◧
♥Table of Contents
▣- <유무>논의와 <상단> 논의를 통한 수행의 방향
다양한 측면에서 <유무>논의를 살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현실에서 갖는 집착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집착>을 잘 제거해야 한다.
그런 사정으로 <자신>에 대해 일으키는 <망상분별>을 제거해야 한다.
처음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렇게 얻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통상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생사과정>에서 한 생을 마친다.
그런 경우 <그런 자신>은 그것으로 모두 <끝>이라고 잘못 여긴다.[단멸관]
이런 경우 <목표>와 <실현방안>을 잘못 찾게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 오히려 장구하게 <생사고통>을 겪어 나가게 된다.
한편 자신에게 참된 진짜인 <자아>가 있다고 잘못 여기기도 한다. [상견]
즉, <자신>의 영원불변한 참된 <실체>가 있다고 여긴다.
이런 경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자신>의 <유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잘못된 견해>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들 내용을 여러 <유무>논의를 살피는 가운데 살폈다.
그러나 <유무>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된다.
그래서 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이들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단멸관>부터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실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는 과정부터 살펴야 한다.
현실에서 매순간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일정한 <분별>을 행한다.
그처럼 <의식 표면>에서 이런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매순간 그처럼 자신으로 여기는< 이들 내용>을 죽 나열해 잇는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한 주체의 <한 생에서의 생로병사> 과정이 된다.
그런데 의식표면에서 이런 내용을 얻는 데에는 <일정한 배경사정>이 있다.
현실 내용은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해 얻는다.
처음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가운데 매 생 <다양한 정신>을 <분화 생성>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현실에서 매 순간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현실 내용>은 <의식 표면에서 작용하는 정신>을 통해 얻는다.
그런 가운데 얻어진 내용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자신>으로 여기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나머지 부분>을 <외부 세상>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 내용>은 모두 이런 <근본정신과 구조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근본정신>은 현실에서 <망상분별>을 잘못 일으키게 하는 배경이 된다.
그런데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는 한 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생사과정>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망집>을 바탕으로 자신을 취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생사윤회>는 한 생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
<무량겁>을 두고 <생사 윤회과정>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생사과정>에서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사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생사윤회과정>에서 <3악도의 생사고통>을 벗어나야 한다.
처음에는 <의식표면에서 얻는 내용>의 일부를 <자신>으로 잘못 여겼다.
그런데 이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통해 <생사윤회> 과정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가 <참된 자신>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런 <근본정신>이 <자신>의 참된 진짜 <실체>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또한 영원불변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갖는 <상견>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상견에 바탕해 일으키는 집착>도 제거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무 분별>을 잘 행해야 한다.
특히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어떤 내용이 <실다운 내용이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집착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경우 유무판단은 일상적인 <유무>판단과는 다르다.
이는 다음을 논의 초점으로 한다.
즉 일정한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 그처럼 실답게 얻어지는가가 초점이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이를 통해 <현실내용>이 <꿈>과 다른 성격의 내용인가를 살펴야 한다.
즉,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다른가를 살펴야 한다.
<꿈>을 생생하게 꾼다.
<현실>에 침대도 그렇게 있다.
그러나 <침대>에서 <꿈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에 <꿈>은 <실답지 않다>고 하게 된다.
<현실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실 내용이 <실재영역>에서 얻어지는가가 초점이다.
그리고 또 현실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 얻어지는가가 초점이 된다.
그런데 <관념>으로 자신을 분별한다.
그리고 먼저 이런 내용이 <감각현실> 영역 등에 그대로 있는가부터 살핀다.
그런 경우 <그런 감각현실 영역>에서는 <그런 관념 내용>을 얻을 수 없다.
한편, 이런 취지로 본바탕이 되는 <실재 영역>을 살핀다.
그런 경우 이들 <관념과 감각현실>은 모두 본바탕 <실재>에서 얻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즉, <현실 내용>은 <실재 영역>에서 얻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감각현실과 관념내용>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침대에서 꾸는 <꿈>과 성격이 같다.
한편, <현실 내용>이 <실다운가>를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내용에는 꿈과 달리 <실체>가 있는가도 살펴야 한다.
그런 경우 현실 내용은 <실체>가 없음을 판단하게 된다.
즉,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뼈대>가 없다.
현실에서 <일정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이런 현실 내용에서 <일부>를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현실을 이처럼 <실상>을 꿰뚫어 관한다.
그런 경우 <현실의 정체>에 대해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다.
<현실 내용> 일체는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한 주체의 '<마음'이 얻어내는 '마음 내용>'이다.
또 그 본바탕이 되는 <실재>에서는 그런 내용을 끝내 얻을 수 없다.
<실재>는 <공>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현실 내용>은 결국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현실 내용>에 대해 일으키는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도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런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고 임한다.
<그 부분>은 본래 <자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그처럼 잘못 여기고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임하게 되는 배경사정>을 또 잘 살펴야 한다.
이는 <생을 출발하기 이전에 일으킨 망상분별> 때문이다.
즉,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먼저 그런 <망상분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견, 아애, 아취, 아만 ]
그런데 이런 바탕에서 태어나 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의식표면>에서 마음이 화합해 <현실내용>을 얻게 된다.
본바탕이 되는 <실재 영역>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매 순간 마음이 화합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는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현실에서 각 내용을 화합해 얻는다.
그렇지만 정작 본바탕이 되는 <실재>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사정으로 <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이런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산소>와 <수소>를 폭발시킨다고 하자.
그런 경우 <물>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경우 산소와 수소가 화합해 물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산소>와 <수소>에서는 <물의 성품이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현실>과 <실재>의 관계도 이와 사정이 같다.
현실에서 마음이 화합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러나 마음 밖 <실재>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런 바탕에서 또 <근본정신과 구조>를 바탕으로 임한다.
그러면 <의식 표면>에서 다시 <일정한 내용>을 그처럼 화합해 얻게 된다.
이렇게 <본 사정>을 이해한다.
즉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얻어낸 자신>은 들어 있지 않다.
또 <그처럼 자신으로 여기는 내용>은 본바탕 <실재>에도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도 없다.
이렇게 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집착>을 제거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전까지 대하던 <감각현실>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자신이란 관념>이 관념영역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올바로 사정을 파악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망상분별>만 사라지는 것이다.
즉 현실 내용에 대해 일으킨 <잘못된 분별>만 사라진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분별>을 바탕으로 갖게 될 <의지>나 <업>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생기 신견>이나 <구생기 변견>은 남아 있게 된다.
이는 태어나기 <이전 단계>에 일으킨 <망상분별>이다.
그리고 이는 <생>을 유지하는 한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생>을 유지하는 한 <이를 바탕으로 한 번뇌>도 계속 유지된다.
즉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이런 <정서적 의지적 번뇌>를 꾸준히 <수행>으로 제거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의 본 정체와 관계>를 올바르게 확실히 관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일단 <망상분별에 바탕해 행하는> <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정서적 의지적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사과정에서 완전히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사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수행자가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다시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과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중생>과 눈높이를 맞춰 일단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생>을 상대해 제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중적인 측면>을 취해야 한다.
본래 <생사현실>은 망상분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내용이 <실답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한다.
즉 <본바탕의 측면>에서는 이들 내용은 본래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내용은 실답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곧 <꿈>과 같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곧 <니르바나>이다. [<생사 즉 열반>]
그리고 이런 사정을 현실에서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현실> 안의 <고통>을 평안히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 중생들이 <망집>을 일으켜 <생사현실>에 묶여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임해 <복덕 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즉 본래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사정으로 그 안에서 좋은 내용을 다시 얻어내야 한다.
그래야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중적인 측면>을 취하게 된다.
즉 <본바탕의 측면>을 통해 <생사고통>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런데 중생이 임하는 <생사현실의 측면>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생이 임하는 생사현실 안에서 <복덕과 지혜 자량>을 얻어낸다.
그래서 이를 위해 <생사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관할 필요가 있다.
즉 <실상>을 꿰뚫어 그 정체를 관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 정체>와 <인과>를 넓고 길고 깊게 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현실에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
그리고 <그 실현방안>도 올바르고 지혜롭게 찾는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위한 선교방편>을 먼저 잘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처럼 <목표>와 <실현방안>을 찾는다고 하자.
한편 이런 내용을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한 바탕에서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각 내용은 대부분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봄>만 놓고 판단한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1년>을 두고 판단한다.
이 두 경우는 서로 결론이 큰 <차이>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다.
결국 <수행목표와 수행방안>은 <일반 세속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
<그 사정>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를 잘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이상으로 <변견>과 <유무판단>의 문제를 마치기로 한다.
▲▲▲-------------------------------------------
이상은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200 ~245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연구참조자료/08장_0부파불교.txt
< 관련부분 > 작업중파일/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100.txt
< $ 200 ~245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
● 다음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246~280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8장_2유식_2_5위백법.txt
cf 부파불교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200.txt
< $ 246~280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Table of Contents
▣- <사견>의 제거
<사견>(邪見, mithyā-dṛṣṭi)은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견해다.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부정한다.
따라서 4성제(四聖諦)도 부정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불교에서는 <연기(緣起)관계>라 표현한다.
이런 <사견>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인과>에 대해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아래에서 이 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인과의 올바른 파악 [지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 한다.
그런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과>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떤 이가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이가 <총기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자.
이 경우 대부분 <총기사고>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에서 설령 <총기사고>가 <없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주체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된다.
그래서 <12연기>를 나열할 때는 이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게 된다.
인과(연기)관계를 <넓고> <길고> <깊게> 관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다음 입장>에서 원인을 살피게 된다.
생사현실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죽음>이 <있게 된다>고 하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죽음>이 <없게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것>을 <죽음과 관계된 원인>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을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것이 <죽음을 만드는 원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곧 <생사>와 관련된 <12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살피면 결국 <근본 무명의 어리석음>이 <생사>를 겪게 하는 근본 원인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한다.
그렇다 해도 이를 쉽게 성취하지 못한다.
반대로 <근본 무명>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이 사정>은 다음과 같다.
생사 현실에서 본래 라고 할 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의 <있고 없음>도 본래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떠 <철수>나 <영희>라고 여기며 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통상 그런 부분은 <그가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관념>도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철수나 영희라고 생각하는 <관념내용>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철수나 영희의 <있고 없음>도 본래 얻지 못한다. [무상삼매 해탈]
또한, 이런 관계는 <본바탕 실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삼매해탈)
한편, 무엇이 <없다가 있게 됨>을 생이라고 한다.
반대로 무엇이 <있다가 없게 됨>을 멸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명의 생멸>을 <생사>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있고 없음>을 처음부터 얻지 못한다.
따라서 생사현실안에서 <생멸>이나 <생사>를 모두 얻지 못한다.
단지 현실에서 <감각현실>을 얻는 상태에서, <그런 관념>을 일으키게 되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근본 무명 어리석음>의 바탕에서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을 취하여 <그 일정 부분>을 <철수>나 <영희>라고 여긴다.
그런 경우 <그런 부분>에 <그가 생각하는 철수나 영희>는 그처럼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또 그런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그 감각현실 영역 부분>에 <내용이 들고 나고 함>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평소 <생멸>로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그런 <철수나 영희>가 끝내 사라진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철수나 영희>가 죽었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근본 무명>의 입장에서는 그런 와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근본 무명>을 제거하고 현실을 관한다고 하자.
그러면 처음부터 <생사를 겪는 내용>이나 <주체>를 그처럼 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멸>이나 <생사>를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현실에서 <생사>가 있게되는 가장 기초적 사정은 각 주체의 <근본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보게 된다.
<근본무명>이 있으면 <생사>가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근본무명>이 제거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서 더 이상 <생멸이나 생사>가 있다는 <망상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현실의 <본 정체>와 <그 인과>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내용>도 잘 성취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다음의 관계>를 통해 현실에서 <연기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 차기고피기此起故彼起)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차무고피무此無故彼無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
어떤 것들이 현실에서 <이런 관계>가 파악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들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를 빼거나 넣거나 한다.
그 상황에서 그에 따라 <다른 b>의 <유무생멸>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 때문에
이런 관계가 곧 <인과 (연기)관계>다.
그래서 위 내용은 <연기관계에 대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기관계의 공식>에 들어맞는 내용들이 무엇들인가를 살펴보자.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데 <일정한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요소>로 다음을 나열할 수 있다.
우선, <이런 내용을 얻게 하는 대상>과 <마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만 이러한 <인과의 문제>를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된다.
그리고 <전후관계>에서 <이들 내용을 얻게 하는 요소>들을 또 고려하게 된다.
결국 그런 내용으로는 모두 <4연>을 나열하게 된다. [인연ㆍ증상연ㆍ소연연ㆍ등무간연]
예를 들어 현재 <사과>를 하나 대한다.
그래서 이 <사과의 생주멸>의 원인을 찾는다고 하자.
이 경우 <사과의 무엇>을 문제삼는가를 먼저 잘 확인해야 한다.
<관념으로서 사과>가 <관념영역>에 어떻게 일으키게 되었는가를 문제삼는가.
아니면 평소 사과로 여기고 취하는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문제삼는가.
이것부터 명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통상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인 사과의 <생주멸>을 파악하려 한다.
그런 경우 먼저 <이런 사과모습을 보게 된 마음내 사정>을 먼저 고려한다. [등무간연],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얻게 한 대상> 내지 <그렇게 얻어진 내용 자체>을 고려한다. [소연연]
다만 여기서 <실재영역의 실재 대상>은 한 주체가 직접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 대상>을 <연기판단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삼는 내용>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연기>도 당연히 살필 수 없다.
따라서 <연기>를 살피려면 <문제삼는 내용>이 일단 필요하다.
평소 사과로 여기고 취하는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외부대상>[外境외경]으로 잘못 여긴다.
즉 <그 내용>을 곧 <그 내용을 얻게 한 외부대상>인 것으로 잘못 여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은 한 주체가 일정한 관계로 <얻어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색(色, 색깔)은 안근에 의존하여 <안식을 통해 얻어낸 내용>이다.
성(聲, 소리)은 이근에 의존하여 <이식으로 얻어낸 내용>이다.
향(響, 냄새)은 비근에 의존하여 <비식으로 얻어낸 내용>이다.
미(味, 맛)는 설근에 의존하여 <설식으로 얻어낸 내용>이다.
촉(觸, 촉감)은 신근에 의존하여 <신식으로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이 모두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여기서 이들은 <외부대상>이 아니다.
즉 이들은 이들 내용을 얻게 한 <외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를 대상[外境외경, 境경]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일단 이를 언어로 가리킬 때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대상[境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여하튼 어떤 내용이 나타난 <연기관계>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렇게 살피는 내용>은 일단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기>를 살필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연기의 한 요소로 포함시키게 된다.
그리고 한편 현실에 평소 사과로 여기고 취하는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한 요소>를 다시 나열할 수 있다.
먼저 처음 <그런 사과가 나타나게 한 핵심 요소>로 <사과 씨>를 생각할 수 있다. [인연因緣]
그리고 <이런 씨>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땅이나 물, 공기> 등도 이런 <사과를 낳게 한 원인요소>에 포함시켜 나열할 수 있다. [증상연増上緣]
그래서 현실에서 이를 간단히 a+b => C 로 표현한다고 하자.
이제 이런 <연기관계>를 통해 다시 다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a, b, C사이에 a+b => C 와 같은 연기의 관계가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다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런 사정 때문에 C는 <무상한 것>이다.
또 그런 사정 때문에 C는 <고통>에 귀결된다.
또 그런 사정 때문에 C는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 때문에 현실에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없다.
또 그런 사정 때문에 C를 얻게 한 <본바탕>은 공하다.
또 그런 사정 때문에 C를 얻게 한 <본바탕>은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는 <니르바나>다.
이런 사정을 모두 위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위 식은 이들 내용을 다 함께 나타내고 있다.
본래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취해 C라고 여긴다.
이 자체가 <망상분별>이다.
즉 현실에 그런 C가 그처럼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망상분별>이다.
이는 <변견>(邊見)에서 <유무(有無) 논의>를 살필 때 사정을 먼저 살폈다.
[참고 ▣- 일반적인 유무판단과 망상분별 ]
[참고 ▣- 무상삼매 ]
그러나 일단 양보하여 현실에 그런 a, b, C 등이 그처럼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들 관계가 위처럼 a+b => C의 <관계>로 파악된다.
즉 일정한 상황에서 a가 있으면 C가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a가 없으면 C가 없게 된다.
그런 경우 그 상황에 a가 <있기> '때문에' C가 <있다>고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간에 <연기>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이것이 현실에서 <연기관계>가 의미하는 바다.
그런데 <일정한 상황>에서 a가 있거나 없거나 한다.
그런데 이런 a의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C가 '있다'고 하자. (또는 없다. 일어난다. 사라진다. )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상황에서 a와 C 사이에 <연기관계성>이 있다고는 밝히기 곤란하다.
다만 어떤 경우에 <그런 관계성>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곧바로 이들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인과관계가 없음>을 단정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경우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 <다른 원인요소>가 함께 병존할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로 인해 이들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석유>로 인해 <불>이 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나무>를 빼거나 넣거나 관계없이 <불>은 일어 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내용으로는 다음 사실들을 단정하기 곤란하다.
즉, <나무>와 <불>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렇다고 <나무>와 <불>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는 단지 그 상황에서 <석유>가 불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경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하튼 <일정한 요소> 간에 <연기관계>가 있음을 파악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일단 a+b => C처럼 기호로 표시하기로 하자.
여기서 이 식은 위와 같은 a, b, C 간에 서로 <연기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런데 위 <식>은 일단 다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일정한 조건>에서는 그런 C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떠나면 그런 C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는 사라진다.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즉 이는 그런 C는 '영원히' 계속 존재하는 내용이 아님을 함께 나타낸다.
그래서 이 식은 곧 그런 C는 '무상'한 존재임을 제시한다. [제행무상]
즉, 그런
한편,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C는 <고통>에 귀결된다.
이런 사정도 <연기관계>를 통해 함께 이해해야 한다.
어떤 주체가 현실에서 이런 C를 <집착>해 대한다.
예를 들어 C가 <좋은 내용>이어서 집착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그래서 <고통>을 준다. [壞苦괴고]
또 C가 나쁜 <내용>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일정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자.
그려면 나타난다.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된다. [苦苦고고]
한편 그런 C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C는 위처럼 <일정한 조건>에 의해 나타行苦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도리가 없다. [행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C는 <고통>에 귀결된다.
따라서 <연기관계>는 이런 사정도 함께 제시한다.
한편, 위 식은 그런 C가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아님도 나타낸다.
우선 위 식은 그런 C가 <그런 관계로 나타난 내용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참된 진짜인 <실체>에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꿈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그것은 꿈처럼, 실답지 않은 것이라고 하게 된다.
반대로 <어떤 것>이 <꿈과 다른 성격>을 갖는 <실다운 것>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처럼 꿈과 다른 성격을 갖는 실다운 것을 일단 관념으로 <실체>라고 하게 된다.
그런 경우 그것은 <꿈과는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참된 실체>는 꿈과 달리, <어떤 조건>에 의존하여 변화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고정 불변>해야 한다.
그런데 위 식은 그런 C가 <그런 특성을 갖지 않음>을 함께 제시한다.
또 앞의 a+b => C의 관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현실에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일체 없음도 나타낸다.
즉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단 하나라도 있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 <위와 같은 관계>가 일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는 <위와 같은 관계>가 적어도 하나는 나타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참된 진짜로서의 <실체>가 없음을 파악하게 된다. [無我무아, 無自性무자성]
[참고 ▣- 실체의 유무 문제]
한편 위 식은 그런 C를 얻게 한 <본바탕>이 공空함도 나타낸다.
위 식은 그 앞 요소에서 그런 C의 품성과 모습을 얻을 수 없음을 함께 나타낸다.
그런데 현실 내용은 한 주체가 이런 연기緣起관계를 통해서만 얻는다.
즉, <마음>에서 화합해 얻게 된다.
그런데 <본바탕 실재>는 결국 <이런 관계>를 일체 떠나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그런 사정으로 각 주체가 끝내 얻을 수 없다.
한 주체는 오직 <그가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방편상 언설로 <공空하다>고 표현하게 된다. [불가득 공]
한편 위 식은 그런 사정 때문에 다음도 나타낸다.
현실에서 <생사>나 <생멸> <고통>을 문제 삼는다.
그런데 이들 <현실 내용>은 이와 같은 관계로 얻는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떠난 <본바탕>을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본바탕>에서는 그런 <내용>과 그 <생사>나 <생멸> 자체를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바탕>은 <생사 생멸>을 떠난 <니르바나> 상태다.
즉, <본바탕>에서는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니르바나>임도 나타낸다.
그리고 위 식이 <그런 관계>를 함께 제시한다. [열반적정]
또 위 식을 통해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의 <생사고통> 또한 실답지 않을 이해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이런 사정>을 잘 관하여 임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머물 수 있게 된다.
[<생사 즉 열반관>]
그런 경우 <생사현실>을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연기관계>에 대해 살핀 논점은 많다.
예를 들어 <원인>에 이미 <그 결과>가 들어 <있었다>고 치우쳐 이해한다. [因中有果論인중유과론]
또는 <원인>에 <결과>는 <없었다>고 치우쳐 이해한다. [因中無果論인중무과론]
이들은 처음 잘못된 <유무판단>에서부터 비롯한다.
즉 현실 한 단면에 무언가 a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부터 잘못 분별한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분별>이 인과 판단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유무有無 극단>에 치우친 잘못된 견해를 낳는다.
또는 현실은 매 경우 <우연>히 나타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優然論우연론]
또는 현실은 각 관계가 <필연>적으로 정해져 나타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必然論필연론]
현실에 <이미 나타난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a 다음에 <결과 b>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주장들은 <그런 내용> 외에 <다른 가능성>의 <유무有無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들 가능성>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가능한 내용>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연론>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 c, d, e 와 같은 가능한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가정 하자.
그런 경우 다음처럼 해석하게 된다.
즉 현실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b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런 경우 <우연론>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가능한 내용들>이 당시 없었다고 가정하자.
즉, 그 상황에 c, d, e 와 같은 <가능한 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b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필연론>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판단은 <다른 가능성>의 <유무 판단>이 그 전제가 된다.
그런데 <가능성>이란 <그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즉, <이런 가능성>은 경험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성격의 내용을 <사변>思辨적으로 전제한다.
그리고 주장을 내세우는 것뿐이다.
한편, 연기(인과)는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차무고피무此無故彼無의 <관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綾起를 제시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관계의 <성격>을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마치 이들이 서로 간에 직접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삼는 이 <각 요소>는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즉,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안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미친다고 보기 곤란하다.
예를 들어 <감각현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 각 부분이 서로 <작용>한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런 결과 <다른 감각현실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잘못 이해한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취해 <조각돌>로 여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일부분>을 취해 <유리병>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낸 내용> 가운데, <일정한 한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즉, <얻어낸 내용 한 부분으로서 조각돌>이 <얻어낸 내용 다른 한 부분인 유리병>을 깨뜨린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감각현실>이 <또 다른 종류의 감각현실>을 나타나게 한다고도 잘못 이해한다.
마치 <눈으로 본 손 모습>이 <귀로 듣게 되는 손뼉소리>를 내게 한다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즉 <시각정보>가 <청각정보>를 나타나게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 상황에서 각 감관별로 얻어낸 <감각현실>들이다.
즉 각 <감각현실>을 <병행>해 얻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
그런 상황에서, <귀>로 소리를 듣는다.
또 그런 상황에서, <코>로 냄새를 맡는다.
또 그런 상황에서, <혀>로 맛을 본다 .
또 그런 상황에서, <손>으로는 촉감을 함께 얻는다.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들 <각 감각내용>은 서로 <부대 상황>의 관계에 있다.
다만 이들은 함께 <실재>에 바탕해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각 주체가 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여러 <식>들이 분화 생성되어 삶에 임한다.
그런 사정으로 현실에서는 이들 <감각내용>들이 서로 <관계>를 갖는 것처럼 인식된다.
이외에도 연기(인과)와 관련되어 살필 <주제>는 많다.
그리고 <인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견해를 취한다.
다만 여기서 이들을 모두 나열해 살피기 곤란하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따로 별도의 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견>은 결국 인과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한 주체가 <인과>에 대해 올바로 판단한다고 하자.
그래서 <생사의 묶임>의 근본원인은 <근본무명 어리석음>임을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서 수행을 통해 <근본 무명>에 바탕해 일으킨 <사견>을 제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본 무명>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에 바탕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런 경우 <그 가치>가 대단히 크다.
현실에서, 한 생에서 한 주체의 <생명과 신체>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는 그 이상의 <무량한 가치>를 갖는 것이 된다.
그래서 <수행>의 가치가 크다.
♥Table of Contents
▣- 견취견의 제거
견취(見取, drstiparāmarśa)는 <그릇된 견해>를 올바른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의 <온갖 내용>에 대해 각기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 주체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무량하다.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 세상>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 각각마다 모두 <일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 가운데 <집착>을 일으키기 쉬운 부분을 먼저 살피게 된다.
그리고 방편상 <제거>가 쉬운 부분부터 살피게 된다.
그래서 먼저 <수행목표>와 <수행방안>에 관련된 계금취견을 살폈다. [계금취견]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부분>은 신견 등에서 살폈다. [신견]
그리고 <상견ㆍ단견> 등의 변견을 살폈다. [변견]
그리고 <인과와 관련된 사견>도 살폈다. [사견]
<그 외 나머지> 온갖 잘못된 견해는 견취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외부 세상>으로 이해하는 내용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많다. [외부세상의 정체]
현실에서 <외부 세상>으로 이해한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들은 사실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에 <그 자신>이나 <외부 세상>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잘못이다.
한편 이렇게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 내용이 있다. [외부 객관적 실재]
그런데 이것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한다.
즉 이들 내용을 자신뿐만 아니라 영희 철수가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
그런 내용을 <다른 철수>가 대할 이치가 없다.
또 자신도 <다른 철수나 영희가 얻어낸 내용>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각 주체는 <제각각> 내용을 얻는다.
한편 이들 <외부 세상>은 <자신의 주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으로 잘못 이해한다.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
그런데 이들 내용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 내용에 <그런 내용을 얻게 한 외부 대상>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외부대상>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견해다.
현실에서 옆에 <영희>를 세워 놓고 관찰한다.
그리고 영희 앞에 사과를 놓고 <눈>을 뜨고 감게 한다.
그 경우 영희가 <눈>을 뜨면 무언가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경우 <자신 입장>에서 이 상황을 관찰한다.
그런 경우 <자신>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변화는 오직 <자신이 영희로 보는 부분>에서만 있는 변화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영희가 <앞에 놓인 사과>를 <대상>으로 그런 내용을 얻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판단>도 잘못된 견해다.
이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쉽다 .
<자신>이 무언가를 본다.
이 때 <영희가 본 내용>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또 <자신>이 <영희가 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영희>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본 내용>을 <대상>으로 삼아 <영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또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영희>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영희라고 여기며 보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영희 밖에 놓인 <사과로 보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들 내용 일체가 사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자신이 얻어낸 이런 내용>을 <대상>으로 삼아 <영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은 아니다.
또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영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견해>다.
또한 <현실 내용>은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내용>이다. [외부물질]
그래서 마음 밖에 따로 있는 <별개의 외부 물질>이 아니다.
그 외에도 자신과 외부세상의 <정체>나 <관계> 등에 대해 수많은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바탕 실재>- <감각현실> - <관념>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
그리고 이런 <망집>을 바탕으로 온갖 지식과 분별을 행한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망상분별>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견취견>의 제거 문제가 된다.
이들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따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참고 ▣- 자신 외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
[참고 ▣- 색은 정신내용이다. - 정신밖 외부 물질이 아니다. ]
이 경우에도 일단 현실에서 <집착을 일으키기 쉬운 견해>부터 잘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거가 쉬운 견해>부터 하나하나 제거해가야 한다.
그런데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을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중생이 집착하는 온갖 견해>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중생의 번뇌>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그래서 세상의 티끌처럼 무량하다.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한 <번뇌제거의 수행>도 무량하게 펼쳐지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탐ㆍ만ㆍ진ㆍ무명>의 <근본제거> - <수도>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잘 제거해야 한다.[탐貪 rāga, 진瞋 dveṣa, 치癡 mūḍha, 만慢 māna]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탐ㆍ진ㆍ치ㆍ만>의 <정체>를 먼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들 <번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집제> 항목에서 살폈다.
[참고 ▣- 탐ㆍ진ㆍ치ㆍ만 [미사혹, 수혹]]
그리고 이들 <번뇌>가 일으키는 문제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들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는 <신견>, <변견>과 관련이 깊다.
즉, 현실에서 어리석음에 바탕해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취해 집착한다. [치癡]
그런 가운데 이런 <자신>에 무언가가 유리하고 좋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탐욕>을 일으킨다.[탐貪]
그리고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에 만심도 갖게 된다.[만慢]
그리고 한편, <자신>에 손해되고 나쁨을 주는 것에는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진瞋]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일으키게끔 된다.
그래서 먼저 <신견>과 <변견>의 번뇌부터 잘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신견>과 <변견>의 근원은 깊다.
즉 이들 번뇌는 <생을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가진 번뇌가 바탕이 된다.
즉 <구생기 신견>과 <구생기 변견>이 바탕이 된다.
현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소 <자신>으로 여기고 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이런 분별>이 <잘못된 신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분별>이 <잘못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너무 바빠서 <자신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어떤 모임에 바삐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 <자신으로 대하던 부분>을 빼놓고 모임에 가게 되지는 않는다.
또는 어떤 경우 무언가에 부딪혀 의식을 잠시 잃었다.
이처럼 <분별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경우에 <자신에 대한 분별>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은 여전히 일정한 활동을 한다.
결국 <현실에서 행하는 신견>은 오히려 <후발적으로 일으킨 분별>이다.
그리고 이들 번뇌는 <생을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가진 <신견>과 <변견>이 바탕이 된다. [구생기신견, 구생기변견]
그리고 <현실에서 일으키는 신견>은 이에 바탕해 <후발적으로 행하는 잘못된 분별>이다. [분별기신견, 분별기변견]
이 경우 <분별기신견>과 <분별기변견>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구생기신견>ㆍ<구생기변견>까지 바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분별기의 신견>과 <변견>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 다시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해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분별기의 신견>과 <변견>부터 잘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한 <업>을 잘 중단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구생기의 신견>과 <변견>을 또 제거해 가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한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도 제거해 가야 한다.
이는 <질병>의 치유과정과 같다.
질병이 <통증>을 일으킨다.
그 경우 <통증>만 제거한다.
그렇다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증>을 방치한다.
그러면 또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고>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일단 <통증>부터 완화시키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근본적인 질병>을 치유하게 된다.
<신견>과 <변견>, <탐ㆍ진ㆍ치ㆍ만>의 제거도 사정이 이와 같다.
결국 분별기에서 후발적으로 일으키는 <신견>ㆍ<변견>, <탐ㆍ진ㆍ치ㆍ만>을 먼저 잘 제거한다.
그런데 이런 번뇌는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가 그 바탕이 된다.
그런 바탕에서 처음 <일정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자신>이라고 잘못 여기게 된다. [구생기 신견]
이런 집착 자체는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그에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 [아치ㆍ아견ㆍ아애ㆍ아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집착>하며 유지해 가려 한다.
그리고 이들 <번뇌>는 생을 유지하는 한, 쉽게 끊어내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구생기 신견>과 <변견>에 바탕해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런 <탐ㆍ진ㆍ치ㆍ만>은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번뇌> 성격을 갖는다. [미사혹迷事惑 ]
그래서 이들 <번뇌>는 <오랜 수행>을 통해 끊어나가야 한다.
이 경우 이들 <번뇌>의 <정체>나 <그 문제점>을 먼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이론적인 이해>만으로 곧바로 이들 <번뇌>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런 견해가 잘못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망집에 바탕해 행하는 반응>이나 <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이론>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생을 유지하는 한 <구생기 신견>과 <변견>이 남아 있다.
그런 가운데 <평소 자신으로 여긴 부분>을 바탕으로 계속 일정한 <감각>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느낌>이나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또 이에 바탕해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일으켜 갖게 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하게 되기 쉽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반응>이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된 망상분별>에 바탕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얻는 <감각>이나 <느낌> <분별> 등도 잘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일으키는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잘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치상 이들이 <잘못된 내용>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당장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잘 참아야 한다.
또 당장 <분노>가 일어나도 평안히 잘 참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근본 어리석음>을 잘 제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행하게 되는 <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선 당장 <불쾌>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이를 평안히 참고 견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행 노력>을 꾸준히 계속 기울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과정에서 이런 <번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들 <번뇌>는 <올바로 이치를 관하는 노력>과 함께 <수행>을 닦아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번뇌를 <수혹>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 경우 기본적인 <예비 수행방안>의 내용도 도움이 된다.
탐욕을 끊는 <부정관>,
분노에는 <자비관>
어리석음에는 <인연관>,
이런 <기본 수행방안>도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를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탐욕>과 <분노>에 대한 집착의 제거
어떤 이가 무언가에 대해 그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런 마음이 <집착>이다.
<집착>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이런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경우 다음처럼 생각한다.
그런 좋음을 이루면 좋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고 무방하다.
그리고 좋다.
이렇게 여긴다.
그리고 이처럼 <집착을 떠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먼저 A라는 상태에 대해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에 <탐욕>을 갖는다.
그리고 집착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집착한다.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에 집착한다.
기타 자신의 가족이나 명예에 집착한다.
그리고 기타 자신의 것에 집착한다.
어떤 것이 너무 좋다고 여긴다.
그래서 탐욕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가깝게 두어 감각하려 한다.
그리고 소유하려 한다.
그래서 마음이 그에 얽매인다.
이는 <탐욕에 바탕한 집착>이다.
그런데 이 경우 <집착>을 제거한다.
그런 경우는 다음 상태가 된다.
어떤 A가 좋기는 좋다.
그러나 그 A가 아닌 상태도 역시 괜찮다.
그 A가 없는 상태도 역시 무방하다.
이처럼 여긴다.
그러면 그는 앞과 같은 집착의 상태를 떠난다.
한편 이와 반대도 있다.
어떤 B가 너무 싫고 고통스럽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다.
예를 들어 병이나 사고를 당한다.
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실한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다.
이런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런 B아닌 상태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런 사정으로 B에도 집착한다.
그래서 그런 B를 평안히 참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B상태를 슬퍼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없애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B를 일으킨 상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이런 상대에 <분노>한다.
그리고 해치려고 한다.
그러나 또 이런 경우에 <집착>을 제거한다.
그런 경우는 다음 상태가 된다.
B가 너무 싫다.
B상태가 고통스럽다.
하지만 B 인 상태도 무방하다.
이처럼 여긴다.
그러면 앞과 같은 집착 상태를 떠난다.
세상에 A와 B가 있다.
그런데 A는 너무 좋다.
그런데 B는 너무 싫다.
그러면 그 A와 B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그래서 그 집착의 강도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각 경우 <집착>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해결된다.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아 <집착>을 갖는다.
그런 경우 <그 나쁜 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반대로 <좋음이 없는 측면>을 찾아낸다.
그러면 좋음을 나쁨으로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그것에 <이미 있는 나쁜 점>을 찾아낸다.
또 그것에 <숨겨진 나쁜 점>을 찾아낸다.
또는 그것을 가질 때 <그 결과로 가질 다른 나쁜 점>을 찾아낸다.
또는 그것을 <달리 나쁘게 보게 될 입장>이 있다.
그런 입장에서 <나쁜 점>을 찾아낸다.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과 비교해본다.
또는 <다른 더 좋은 것>들과 비교해본다.
또는 <그것 대신에 있었을 좋은 점>과도 비교해본다.
또는 <유사한 다른 좋은 것>들과 비교해본다.
이런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것에 좋은 점이 없는 측면>을 관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좋음과 나쁨을 서로 중화시킨다.
그러면 이를 통해 그 집착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
그리고 이런 방안이 <부정관 수행>에 해당한다. [부정관]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이를 너무 싫어한다.
그런 경우 문제 상황에 처한다.
이 경우도 원리는 같다.
그런 경우 <그 좋은 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반대로 <나쁨이 없는 측면>을 찾아낸다.
그러면 나쁨을 좋음으로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그것이 <이미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숨겨진 좋은 점>을 찾아낸다.
또는 그것을 가질 때 <결과로서 가질 좋은 점>을 찾아낸다.
또는 그것을 <달리 좋게 보게 되는 상태>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낸다.
또는 그것보다 <더 나쁜 것>과 비교한다.
또는 <다른 더 나쁜 것>들과 비교한다.
또는 <그것 대신에 있었을 나쁜 점>과 비교한다.
또는 <유사한 다른 나쁜 것>을 살핀다.
그래서 그것에 그런 <나쁜 점>이 없는 측면을 잘 관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나쁨과 좋음을 서로 중화시킨다.
그러면 이를 통해 그 집착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
그리고 이런 방안은 <자비관 수행>에 해당한다. [자비관]
결국 A나 B나 좋고 나쁨의 차이를 줄인다.
<좋은 것>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그러면 <독>을 일으킨다.
또 <나쁜 것>에 과도하게 싫어한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집착한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 위와 같은 방안으로 어느 정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초적 예방방안>이다.
즉 <예비 단계>의 <기초 수행방안>이다. [3현]
그런데 <탐욕>과 <분노>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근본적으로 생사현실>의 본 정체를 잘 관한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이처럼 <각 부분>을 취해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분별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런 내용>이 본래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을 잘 관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삶에 임한다.
그러면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한편, 이미 <탐욕>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를 참고 억제한다.
그러면 당장 <불쾌>와 <고통>을 느낀다.
이미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참고 억제한다.
그러면 당장 <불쾌>와 <고통>을 느낀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탐욕>과 <분노>를 꾸준히 억제한다.
그런 상태에서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태를 평안히 참고 견딘다.
현실에서 <상>을 취하지 않고 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의 정체>에 대해 먼저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래서 <유무 판단>과 관련해 올바로 잘 살핀다.
이는 이미 <신견>과 <변견> 등에서 살폈다.
[참고 ▣- 현실의 유무분별과 망집 ]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치>적으로 확고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현실>에 임해야 한다.
---
번뇌심소(煩惱心所 kleśa-caitasa) (6)
탐(貪 rāga)
각 중생은 망상에 기초해서 3계(욕계,색계, 무색계)에 임한다.
그리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가운데 자기 상태에 적합한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 내용을 좋음의 느낌을 얻는다.
그래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愛]
그런 가운데 이에 접착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애착을 갖고 대한다. ( → 욕탐, 색탐, 무색탐)
이러한 마음작용을 ★탐(貪 rāga)이라 한다.
즉 일정한 내용에 대해 좋아하고 집착을 갖고 대하는 마음이다.
즉 애착, 탐욕이다.
이는 본래 실답지 않은 것이다.
한편 욕계내 인호기는 탐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망상 분별에 기초한다.
그래서 욕계내 타 주체와 상충되어 침해하는 성격을 함께 갖는다
그래서 더러움, 악에 오염된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망집과 악에 접착되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염착染著]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악업을 일으키는 기초가 된다.
$=탐
② 근본 번뇌(根本煩惱)
★근본번뇌(根本煩惱)에는 6 근본번뇌가 있다.
★탐(貪) ★진(瞋) ★치(痴) ★만(慢) ★의(疑)와 악견(惡見)이 그것이다.
악견(惡見)은 다시 다음 5 견으로 분류된다.
★유신견(有身見) ★변집견(邊執見) ★사견(邪見) ★계금취견(戒禁取見) ★견취견(見取見)
$=근본번뇌, 탐진치만의,유변사계견(貪瞋痴慢疑 有邊邪戒見)
♣ 탐(貪 rāga):
각 주체는 상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자기의 감정에 적합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즐겁고 좋은 느낌을 얻는다.[樂受낙수]
그러한 경우 이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에 달라붙어 집착하게 된다.[愛着애착]
이를 탐이라고 칭한다.
이후 이 탐에 기초해 원을 일으킨다.
즉 탐은 욕망, 탐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후 이에 기초해 업을 행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집착하며 추구해가게 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주체와 가해와 피햬 관계를 쌓아나가게 된다.
이것이 업의 장애를 쌓게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겪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탐(貪)은 생사고통을 겪게 만드는 주된 근본 원인이 된다.
-> 제거방안: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꿈과 성격이 같다.
꿈에서 금을 얻어도 실제 얻는 것이 아니다.
금을 잃더도 실제 잃는 것이 아니다.
생사현실에서는 오히려 아낌이 없이 베풀어야 복덕을 얻게 된다.
아끼면 오히려 복덕을 잃는다.
- 집착하는 것이 사실은 더러운 것임을 꿰뜰어 관한다.
속에 오물이 가득하다.
나중에 결과로 오물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부정관을 취한다.
진(瞋 pratigha, dveṣa, doṣa, krodha)
화가 나서 심신을 불편하게 하는 심리작용을 ★(瞋 pratigha, dveṣa, doṣa, krodha)이라 한다.
거슬리는 내용에 대해 반감이나 불쾌해하며, 미워하고[憎] 성내고[恚] 노여워하는 마음이다.
진심(瞋心)을 일으키면 상처입히고 해치는 것을 좋아하고, 만 가지의 업(業)을 지어 장애를 스스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인욕(忍辱)을 닦아 성내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진
♣ 진(瞋 doṣa ; dveṣa ; krodha ~ 분노. **):
각 주체는 상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자기의 감정에 거스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고통스럽고 나쁜 느낌을 얻는다.[苦受고수]
그래서 심신이 불쾌를 느끼며 불편해진다.
그러한 경우 이에 반감을 느껴 싫어한다.
그리고 거부하고 멀리하려 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벗어나고 뿌리치려 한다.
그래서 화를 낸다. [忿怒분노]
이를 진(瞋)이라고 칭한다.
이후 이는 그런 불쾌를 주는 대상을 파괴하고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후는 탐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후 이에 기초해 업을 행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집착하며 추구해가게 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주체와 가해와 피햬 관계를 쌓아나가게 된다.
이것이 업의 장애를 쌓게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겪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진(瞋)은 생사고통을 겪게 만드는 주된 근본 원인이 된다.
-> 제거방안: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꿈과 성격이 같다.
꿈에서 금을 얻어도 실제 얻는 것이 아니다.
금을 잃더도 실제 잃는 것이 아니다.
생사현실에서는 오히려 아낌이 없이 베풀어야 복덕을 얻게 된다.
아끼면 오히려 복덕을 잃는다.
- 집착하는 것이 사실은 더러운 것임을 꿰뜰어 관한다.
속에 오물이 가득하다.
나중에 결과로 오물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부정관을 취한다.
♥Table of Contents
▣- <어리석음>의 제거
<치>(癡)는 진실을 바르게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치>와 <사물>에 대해 어두운 상태다. [치癡 moha, 무명無明, avidyā․mūdha]
모든 번뇌의 일어남에는 치(癡)가 결부된다. (『성유식론』 권6)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인연관>을 닦는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잘 관한다.
그런 가운데 그 모습ㆍ성품ㆍ각 부분과 구조ㆍ
그리고 전체와의 관계ㆍ그 본질ㆍ그 힘과 작용ㆍ
다른 것들과의 상호 관계ㆍ그 발생원인ㆍ결과ㆍ등에 대해 살펴나간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언어>ㆍ<관념>ㆍ<감각현실>ㆍ<본바탕 실재>ㆍ<실체>의 차원과 관련해 자세히 살핀다.
그래서 <실상>을 꿰뚫어 그 내용을 넓고 길고 깊게 관한다.
즉 여러 주체의 입장에서 <넓게> 살펴본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생명체가 대하는 내용도 헤아려 본다.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길게> 살펴나간다.
그리고 하나의 내용이라도 <다양한 기준>과 <측면>을 통해 살펴 나간다.
그리고 다양한 내용과의 관계를 <깊게> 살펴 나간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문>을 많이 듣는다. [문혜]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헤아린다. [사혜]
그리고 배운 내용을 많이 <닦아> 익힌다. [수혜]
---
치(痴 moha, mūḍha, avidyā)
사리나 도리를 모르는 마음을 ★(痴 moha, mūḍha, avidyā)라 한다.
어리석음, 우치, 무지, 무명(無明)을 일컫는 말이다.
갖가지 본질[理]과 현상[事]에 대해 미혹하고 어두운[迷闇] 마음이다.
$=치
♣ 치(痴 moha ; mūḍha):
사리나 도리를 모름이다. 어리석음, 무지, 어리석음.
-> 제거방안:
인과를 올바로 관한다.
각 영역을 잘 구분해서 분별한다.
공한 실재와 현실을 혼동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안에서 감각현실과 관념영역을 혼동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을 한 영역에서 얻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른 영역에도 얻는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각 내용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꿈과 성격이 같다.
♥Table of Contents
▣- <만>(慢)의 제거
<만>(慢)은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과 비교한다.
그런 가운데 오만한 <마음> 상태를 뜻한다. [만慢 māna]
만으로는 다음의 아만, 증상만, 사만, 만과만, 과만, 비만, 만의 7만을 나열하기도 한다 .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예를 들어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의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애착>을 갖는다.
그리고 <집착>한다.
그리고 이런 자신에 대해 다음처럼 잘못 여기기도 한다.
즉 이런 부분에 참되고 고정된 영원불변한 진짜 자신의 <실체>가 있다. (→ 아견 / 아뜨만 )
또 이런 자신이 영원히 유지된다( → 상견)
이처럼 잘못 여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린다.
이를 <아만>(我慢)이라 한다.
한편 자신이 일정한 <수행 단계>를 증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미 <증득>했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린다.
이를 <증상만>(增上慢)이라 한다.
한편 자신이 일정한 <덕>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덕>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사만>(邪慢)이라 한다.
한편 자신을 <다른 이의 상태>와 비교해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음처럼 다양한 형태로 잘못 평가한다.
우선 자기보다 <뛰어난 이>가 있다.
이 경우 자기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잘못 판단한다.
이를 <만과만>(慢過慢)이라 한다.
한편 앞 경우에 자기와 <동등>하다고 한다.
한편 자신과 <동등한 이>가 있다.
그런데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잘못 판단한다.
이런 경우를 <과만>(過慢)이라 한다.
한편 앞 경우에 자신이 실제 열등한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보다 낮추어 <조금만 열등>하다고 잘못 판단한다.
이를 <비만>(卑慢)이라 한다.
이처럼 각 경우 모두 자신의 수준을 잘못 평가한다.
한편 자신과 동등한 이에 대해서 동등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열등한 자에 대해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만>(慢)이라 한다.
- 문제점
뒤 경우는 평가 자체만은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각 경우 이를 통해 <오만>하게 우쭐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 들어올린다.
그런 경우 우선 <그 상태>에 만족해 머물러 정체하게 된다.
그리고 보다 높은 상태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보다 못한 다른 이는 <경시>한다.
그리고 <오만한 자세>로 다른 이를 대한다.
그리고 다른 이를 따돌려 배척한다.
그리고 다른 이의 덕성을 올바로 평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이를 공경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신보다 덕성이 높은 이를 깍아내린다.
그리고 공연히 질투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받게 한다.
또 그로 인해 다른 이들부터 <미움>을 받는다.
따라서 다른 이의 협조와 도움도 받지 못한다.
설령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덕성이 있다해도 <시기>를 받게 된다.
심한 경우 침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 이로 인해 서로 가해 피해를 주고 받게 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받아가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이를 이끌어 나아가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다른 이들이 반발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이를 나은 방향으로 제도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만심>을 제거해야 한다.
- 망상분별의 제거
먼저 <아만>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잘 관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된 자신>이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한다.
- 부족한 점의 자각과 향상에 대한 의지
한편 자신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수행과 덕성>을 스스로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증상만>(增上慢)과 <사만>(邪慢)을 제거한다.
자신이 어떤 공덕이나 덕성을 갖추었다고 하자.
그러나 한편 타인의 정체와 덕성도 잘 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이>의 상태를 올바로 잘 살핀다.
한편 자신이 어떤 공덕이나 덕성을 갖추었다고 하자.
그래서 이에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런데 인과상 자신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일은 현실에 드물다.
예를 들어 다른 생명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 그런 성취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점을 함께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단점, 한계 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 치우친 자세를 떠나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살핀다고 하자.
그리고 또 수 많은 다른 경우들과 비교한다.
그런 경우 늘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늘 부처님의 덕성에 비추어 <부족한 자신>을 되돌아 본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점>을 찾아 살핀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지닌다.
- 다른 이에 대한 긍정, 인정, 존중, 찬탄, 공경, 공양, 수희, 원요
한편 <다른 이>의 상태를 살피고 비교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한 순간의 외관만 관한다고 하자.
그러면 곤란하다.
전후 내력과 <숨겨진 내면>까지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이의 <숨겨진 덕성>을 잘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중생이 갖춘 <잠재적 가능성>을 잘 평가해야 한다.
한편 다른 이가 일정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 단면만 갖고 짧게 평가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장차 가능성의 측면으로 대한다.
그리고 반대면을 취하면 이런 내용도 또한 자신의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덕을 전혀 갖지 않고 단점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다른 이의 공덕을 찾아 긍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성취도 어떤 한 개인 혼자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헤아려야 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모든 중생이 과거의 <자신의 부모>라고 관해야 한다.
무시 무종의 시간대에 모든 중생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본 바탕에서는 어떤 중생도 부처와 <차별>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모든 중생이 <성불할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중생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고 다른 이를 공경하며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다른 모든 생명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이를 돕고 베풀며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선과 수행 측면에서 <뛰어난 상태>는 따라 기뻐한다. [随喜수희]
그리고 특히 자신보다 덕과 지혜가 높은 <스승>과 <부처님>을 잘 관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성취하기를 바란다. [願樂원요]
그래서 이런 <만과만ㆍ과만ㆍ비만ㆍ만> 등이 갖는 문제점을 잘 제거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더 높은 상태를 향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높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한다.
---
만(慢 māna)
다른 사람을 경시(輕視)하고 남에 대해 자신을 높이는[高舉] 거만한 마음을 ★(慢 māna)이라 한다.
만은 다음 7종으로 세분해 나열하기도 한다.
★(七)가지 만은 다음이다.
★(慢, māna) : 자기 보다 <못한 이>에 대하여 우월감을 품고 높은 체 하는 것
★만(過慢, ati-māna) : 자신과 <동등한 이>와 비교하여 자기가 뛰어나다고 높이는 것
★과만(慢過慢, mānāti-māna): 자신보다 <뛰어난 이>에 대하여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높이는 것.
★만(卑慢, ūna-māna) :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이>와 비교하여 자신이 조금 떨어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我慢, ātma-māna):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상만(增上慢, adhi-māna) :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만(邪慢, mithyā-māna) : 덕 없는 이가 스스로 덕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악한 일을 한 뒤에도 스스로 잘했다고 뻐기는 것.
$=만, 7. 만과만비아 증사(慢過慢卑我增邪)
♣ 만(慢 māna):
타인을 경멸하고 자신을 높이는 거만한 마음이다.** 교만,
-> 제거방안:
자신보다 뛰어난 수행자를 공경 존중한다.
자신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식한다.
♥Table of Contents
▣- 번뇌를 끊어가는 수행단계 3도- 4향4과
♥Table of Contents
▣- 수행을 통해 끊어야 할 번뇌의 구분
수행을 통해 끊어야 할 <번뇌>가 있다.
여기에 <견혹>과 <수혹>의 구분이 있게 된다.
번뇌 가운데는 <이치>를 올바로 관하여 끊어야 할 번뇌가 있다.
이를 <견혹>이라고 부른다.
한편 단순히 <이치>만 관해서 끊어지지 않는 번뇌가 있다.
이는 이치를 관한 상태에서 다시 꾸준히 <수행노력>을 기울여 끊어나가야 할 번뇌다.
이를 <수혹>이라고 부른다.
♥Table of Contents
▣- 견혹
<견혹>에는 구사ㆍ유식 양 입장에서 다음 10종류의 번뇌를 나열하게 된다.
[견혹見惑, 견도소단혹見道所斷惑, darśana-mārga-prahātavyānuśaya]
신견(身見)ㆍ변견(邊見)ㆍ사견(邪見)ㆍ견취견(見取見)ㆍ계금취견(戒禁取見)의 5리사(五利使),
탐(貪)ㆍ진(瞋)ㆍ만(慢)ㆍ치(癡)ㆍ의(疑)의 5둔사(五鈍使)가 이에 해당한다.
♥Table of Contents
▣- 수혹
꾸준한 <수행>을 닦아 끊어야 할 번뇌가 <수혹>이다.
[수혹修惑, 수도소단혹修道所斷惑, bhāvanā-mārga-prahātavya-kleśa]
그런데 어떤 것이 <수혹>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입장별로 차이가 있다.
즉 구사종(俱舍宗)과 유식종(唯識宗) 양 입장에 차이가 있다.
구사종에서는 먼저 <미리혹>(迷理惑)과 <미사혹>(迷事惑)을 구분한다.【1】
여기서 <미리혹>은 <관념적 분별>과 관련해서, 이치[理]에 헷갈리고 어지럽혀진[迷미] 지적 번뇌[惑혹]다.
한편, <미사혹>은 <감각현실>에 기초해, 감정과 의지에 관련된 정서적 의지적 번뇌다.
여기서 이(理)와 사(事)는 <관념분별내용>과 <감각현실>의 구분에 상응한다.
각 주체는 감관을 통해 <감각현실>로 <색ㆍ성ㆍ향ㆍ미ㆍ촉>(色聲香味觸)을 얻는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다시 <분별>을 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눈>을 떠 <색>을 얻는다고 하자.
이런 <색> 등에 대해 <관념적 판단>을 행한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또는 일정부분을 <행위자>나 <자재자>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등은 <미리혹>이다.
한편, <눈>을 떠 <색>을 얻는다고 하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초로 좋고 나쁨을 느낀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染著],
또는 싫어한다. [憎背],
또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린다. [高擧],
또는 알지 못하고 어두운 상태로 임한다.[不了]
이러한 행상들을 일으킨다. 【2】
그러나 이는 이들 내용에 대해 <관념적 분별>[審慮심려]을 일으킨 경우는 아니다. 【3】
이런 경우는 <미사혹>이다.
그래서 <미사혹>으로는 탐(貪)ㆍ진(瞋)ㆍ만(慢)ㆍ치(癡)을 나열한다.
이는 염착됨[貪]ㆍ미워함[瞋]ㆍ높임[慢]ㆍ이해하지 못함[癡]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미사혹을 <수혹>이라고 한다.
한편 <유식종>에서는 분별기혹(分別起惑)과 구생기혹(俱生起惑)을 구분한다.
<분별기혹>은 분별로 일으키는 번뇌다.
그리고 이를 <견혹>이라 한다.
한편 <구생기혹>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번뇌다.
그리고 이를 <수혹>이라고 한다.
이런 수혹으로 <탐>(貪)ㆍ<진>(瞋)ㆍ<만>(慢)ㆍ<치>(癡)에 <구생기 신견>ㆍ<구생기 변견>을 추가하게 된다.
결국 수혹에 대해 <구사종>에서는 <탐>(貪)ㆍ<진>(瞋)ㆍ<만>(慢)ㆍ<치>(癡)를 나열한다.
그리고 <대승유식종>에서는 이에 <구생기 신견>ㆍ<구생기 변견>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혹>은 <견도>ㆍ<수도>를 종합해서 함께 끊어가게 된다.
즉, 이 수혹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바로 끊기 힘들다.
이에 기초해 꾸준한 <수행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견>을 놓고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이를 <신견>이라고 칭한다. [분별기신견]
이는 잘못된 <망상분별>의 하나다.
그런데 이런 <신견>이 잘못임을 <이치상>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도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 부분>은 이후로도 여전히 그 특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평소 몸으로 여긴 부분>에서 여전히 <일정한 감각>을 얻는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좋고 나쁨 등의 느낌>을 얻게 된다. [정서]
또 배고픔, 소대변 등의 <생리적 욕구> 등도 일으켜 갖게 된다. [의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일정한 <정서적> <의지적>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생>을 유지하는 한 이런 특징은 계속 유지된다.
이는 생을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 일으킨 <선천적>인 망집번뇌에 의한 현상이다.
즉, <구생기 신견ㆍ변견> 등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탐ㆍ진ㆍ치ㆍ만>과 같은 번뇌를 갖는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번뇌는 단순히 <이치>만 관해서 끊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번뇌를 끊는 데에는 <지속된 수행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우선 <이치>적으로 확고하게 이런 <배경 사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감각적ㆍ정서적ㆍ의지적인 부분>을 꾸준히 제어한다.
그리고 평소 <분별기 신견>에 기초해 행하던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이런 <선천적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을 꾸준히 행한다.
그리고 다시 <감각적 정서적, 의지적인 부분>도 그런 <수행자세>를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평안하게 참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생사과정>에서 <이런 번뇌>를 끊게 된다.
【주석】---
【1】 { K0955V27P0637a08L; 皆如是而有差別以修斷惑各有別事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25권, 6.분별현성품④,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2】 { K0955V27P0637a14L; 色等境中唯起染著增背高擧不了行轉故竝說爲依有事惑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25권, 6.분별현성품④,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3】 { K0955V27P0637b03L; 或修斷惑非審慮生昧鈍性故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25권, 6.분별현성품④,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수번뇌
한편 번뇌에는 <근본번뇌> 이외 <수번뇌>가 있다.
<수번뇌>는 <근본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2차적 번뇌>를 뜻한다.
<수번뇌>로 <유식종>에서는 20종류를 든다.
이런 번뇌도 함께 끊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나열해 살피기로 한다.
---
▣ 수번뇌심소(隨煩惱心所) (20)
근본번뇌의 작용에 의해 이끌려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
이는 근본번뇌와 같은 부류다.
이를 ★수번뇌심소(隨煩惱心所)라 한다.**
여기에는 대수혹(大隨惑) (8) 중수혹(中隨惑) (2) 소수혹(小隨惑) (10) 이 나열된다 .
$=수번뇌심소
♥Table of Contents
▣- 대수혹(대번뇌지법)
<번뇌>에 물들어 <오염된 마음>이 있다.
이를 <염오심>(染污心 kliṣṭa-citta)이라 한다.
이런 <염오심>과 <늘 함께> 일으키는 번뇌가 있다.
이를 <유식종>에서는 <대수혹>이라고 한다.
한편 <구사종>에서는 <대번뇌지법>이라고 한다.
<유식종>에서는 대수혹으로 다음 8종류를 나열한다.
불신(不信)ㆍ해태(懈怠)ㆍ방일(放逸)ㆍ혼침(惛沈)ㆍ도거(掉擧)ㆍ
<산란>(散亂)ㆍ<실념>(失念)ㆍ<부정지>(不正知).
<구사종>에서는 대번뇌지법으로는 다음 6종류를 나열한다.
<불신>(不信)ㆍ<해태>(懈怠)ㆍ<방일>(放逸)ㆍ<혼침>(惛沈)ㆍ<도거>(掉擧)ㆍ
치(癡),
두 입장은 다음에서 차이가 있다.
구사종에서는 <산란>(散亂)ㆍ<실념>(失念)ㆍ<부정지>(不正知)를 제외한다.
그리고 <치>(癡)를 넣는다.
그리고 이를 실체적 요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표현이 어렵다. 대강 다음 상태를 뜻한다.
♥Table of Contents
▣- 불신(不信)
불신은 불ㆍ법ㆍ승 3보(寶) 및 그 가르침(4제법 등)에 대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맑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집착한다.
그래서 성현(聖賢)의 실덕(實德)을 닦음에 장애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불신(不信)이라고 한다. [불신不信, āśraddhya]
$=불신
이런 상태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는 <의심>의 항목에서 본 방안에 준한다.
[참고 ▣- 의심의 제거]
그래서 불ㆍ법ㆍ승 3보(寶) 및 그 가르침(4제법 등)에 믿음을 갖도록 한다.
이는 중복을 피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해태(懈怠)
<해태>는 <수행에 임한 후> 근면하지 않다.
그리고 <게으름> 피우는 마음상태다.[해태懈怠, kausīdya]
곧 정진(精進)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악(惡)을 끊고 선(善)을 닦는 일에 진력(盡力)을 다하지 않는다.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는 <정진>의 항목에서 본 방안에 준한다.
<수행목표> 상태의 좋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그려가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성취를 원한다.
그리고 <성취에 필요한 원인행의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는다.
한편 수행과정이 힘들어 지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자주 쉰다.
그러면서 다시 꾸준히 <반복>해간다.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방일(放逸)
<방일>은 수행을 닦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내맡기고 <방치>한다.
그래서 착함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
그래서 깨끗함(淨)을 닦지 않는다.
그리고 번뇌의 오염(染)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리고 제멋대로 임하며 방종한다.
그러한 마음상태다. [방일放逸, pramāda]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는 앞 <해태> 항목의 방안에 준한다.
♥Table of Contents
▣- 혼침(惛沈)
마음이 침울(沈鬱)하게 <가라앉은> 상태다
그리고 어둡다.
몸도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가볍고 평안한(輕安경안) 상태가 아니다.
이를 ★혼침(惛沈, styāna) 이라 한다.
이런 경우 대하는 현실 내용을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물도 잘 분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올바른 관찰(正觀)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수행에 장애가 있다.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마음에 <광명상>을 떠올린다.
또는 자신이 희망하는 아름답고 선한 <서원>을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려간다.
0629#
♥Table of Contents
▣- 도거(掉擧)
<도거>는 마음이 <들떠 안정되지 못한> 마음상태다.[도거掉擧, auddhatya]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 제거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머문다.
그리고 <망념>(妄念)을 쉰다.
이런 노력으로 제거한다.
---
도거(掉擧, 掉擧, auddhatya)
마음이 들떠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掉擧, auddhatya)라고 한다.
그래서 대하는 경계에 대하여 고요하지 못하고 멈춰 쉬지 못함을 뜻한다.
$=도거
♥Table of Contents
▣- 산란(散亂)
<산란>은 대상에 대해 흩어져 어지러운 마음상태다.[산란散亂, vikṣepa]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아 <집중>한다.
<수식관>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
<혼침> <도거> <산란> 상태에서는 <삼매> 수행을 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삼매> 수행에 정진하면 이들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삼매>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참고 ▣- 정(定: 삼매)
----------------
CF- 산란 이하 부터는 유식종 대수혹에서만 나열하는 내용이다.
산란(散亂, vikṣepa)
경계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안정을 상실하고 어지러운 마음상태를 ★★(散亂, vikṣepa)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정(正定)을 닦음에 장애가 있는 상태다.
$=산란
♥Table of Contents
▣- 실념(失念)
<실념>은 명백히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상태다.[실념失念, musita-smṛtitā]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미 기존부터 <잘 지니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새로 익힌 내용>을 마음에 잘 지니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다른 이를 위해> 잘 알려주려는 마음으로 이를 대한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기존 내용에 잘 <연결 결합>시킨다.
그리고 이후 이들 내용을 <반복>해 되살려 떠올린다.
그래서 마음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실천>한다.
이런 방안이 도움이 된다.
이런 방안은 <정념>의 항목에서 본 방안에 준한다.
참고 ▣- 정념
<념>은 수행 전반에서 중요하다.
4여의족ㆍ5근ㆍ5력ㆍ7각지ㆍ8정도에 항목에 모두 들어 있다.
<수행하고 익힌 내용>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
경전에 다음 방안들이 제시된다.
...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신통과 훌륭한 사업을 성취하길 바란다면,
당연히 <네 가지 법문>을 두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첫째는 매우 심오한 법에 대하여 그 법을 <기뻐하여 듣고 받는 것>이며,
둘째는 널리 <다른 이를 위하여> 매우 심오한 법을 연설하는 것이며,
셋째는 들은 법을 따라 그 뜻을 <청하여 묻는 것>이며,
넷째는 그 법을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며 이치대로 <수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네 가지 법문이니라.【1】
...
---
실념(失念, musita-smṛtitā)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失念, musita-smṛtit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념(正念)을 닦음에 장애가 있는 상태다.**
$=실념
【주석】---
【1】 { K1425V40P0323b06L; 佛告普華幢天子言若菩薩摩訶薩 『불설대승부사의신통경계경』(佛說大乘不思議神通境界經), 상권, 송 시호역(宋 施護譯), K1425, T0843 }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부정지(不正知)
이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誤解오해]를 갖는 마음상태다.[不正知부정지, asamprajanya]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연관>을 닦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이 듣는다.
그리고 많이 헤아린다.
그리고 많이 실천을 닦는다.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
이는 곧 <문혜>ㆍ<사혜>ㆍ<수혜>의 방안이다.
---
부정지(不正知, asamprajanya)
면전에 나타난 경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 대상에 대한 오해(誤解)를 갖는 마음상태를 ★★★(不正知, asamprajanya)라고 한다.
따라서 정지(正知)를 얻는데 장애가 있는 상태다.**
$=부정지
♥Table of Contents
▣- 치(癡)
이는 여실(如實)하게 <알지 못한> 마음 상태다. [癡치, moha, 無明무명, avidyā,]
즉, 진리에 통달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사물의 도리를 명백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는 앞의 부정지의 항목에 살핀 방안에 준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계ㆍ정ㆍ혜 수행의 일반적 방안이 모두 요구된다.
특히 <지혜>의 항목에 살핀 내용이 이를 제거하는 기본 방안이다.
참고 ▣- 지혜를 통한 근본적 번뇌 제거
---
----------------
CF- 아래 치는 구사론에서만 나열하는 내용이다.
CF- 치(癡, moha, 무명無明, avidyā)
여실(如實)하게 알지 못한 마음 상태를 ★(癡, moha, 무명無明, avidyā,)라고 한다.
진리에 통달하지 못해 사물의 이치를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치(癡)는 구사론의 대번뇌지법에서만 나열된다.
*掉(흔들, 흔들리다 도)
☞ 대수혹 8 (=구사론 대번뇌지법6)
★★(唯識) 힉파는 ★★★(大隨惑)으로 ★(八)가지를 나열한다.
★신(不信, āśraddhya) ★태(懈怠, kausīdya) ★일(放逸, pramāda ) ★침(惛沈, styāna) ★거(掉擧, auddhatya)
★란(散亂, vikṣepa) ★념(失念, musita-smṛtitā) ★정지(不正知, asamprajanya)
『★★론』(俱舍論)은 ★★★★★(大煩惱地法)으로 다음 ★(六)가지를 나열한다. : ★신(不信)ㆍ★태(懈怠)ㆍ★일(放逸)ㆍ★침(惛沈)ㆍ★거(掉擧)ㆍ★(癡)
결국 유식종 대수혹 (8) 은 = 구사론 대번뇌법 (6) 에 + 산란(散亂)ㆍ실념(失念)ㆍ부정지(不正知) (3)을 더하고 - 치 (1)를 뺀 것이 된다.
$=유식 대수혹 8 불해방혼도 산실부(不懈放惛掉 散失不) / 구사 대번뇌지법 6 불해방혼도 치 (不懈放惛掉 癡)
♥Table of Contents
▣- 중수혹(대불선지법)
한편, <악한 마음>[不善心불선심]과 늘 함께 일으키는 번뇌가 있다.
무참(無慚)ㆍ무괴(無愧)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견도>와 <수도>를 통해 끊어야 할 번뇌다.
이를 유식종에서는 <중수혹>(中隨惑)이라 칭한다.
구사종에서는 이를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이라고 칭한다.
▣ 중수혹(中隨惑) (2):
불선심(악한 마음)과 늘 함께 일으키는 번뇌다.
중수혹(中隨惑) (2)
♥Table of Contents
▣- 무참(無慚)ㆍ무괴(無愧)
<무참>은 참(慚)이 없는 상태다. [無慚무참, āhrīkya]
<무괴>는 괴(愧)가 없는 상태다 [無愧무괴, anapatrapaya]
따라서 무참 무괴는 참과 괴의 개념부터 살펴야 한다.
참(慚)과 괴(愧)는 서로 엇비슷한 개념이다. [참慚 hrī, 괴愧 apatrapā]
이는 모두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에 기초한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독립 항목으로 나열된다.
그래서 이들의 <의미 구분>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다. 【1】
그래서 각 입장따라 약간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들은 여하튼 선악 가치 판단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수행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이다.
어떤 계기나 어떤 경로 어떤 방식으로든 선악 가치판단을 잘 행한다.
그래서 무참 무괴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치판단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나쁨을 살핀다.
그것도 여러 주체를 놓고 넓게 관한다.
또 오랜 기간에 걸쳐 길게 인과를 관한다.
또 다양한 측면을 놓고 깊게 관한다.
그리고 단순한 좋음과 가치있는 선을 구분한다.
그래서 자신도 좋고 남도 좋고 온 생명이 차별 없고 제한 없이 좋은 상태를 찾는다.
그리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오랜 기간에 걸쳐 좋은 상태를 찾는다.
그리고 이 측면도 좋고 저 측면도 좋고 두루두루 좋은 상태를 찾는다.
그래서 선악 판단을 잘 행한다.
위 내용은 물론 이상적이다.
그런데 이 각 부분에서 결함이 생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바로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개선해나간다.
그런 내용을 살핀다.
- 무참(無慚, āhrīkya,)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무참(無慚, āhrīkya)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과 법의 힘에 의지하여, 현인(賢人)과 선법(善法)을 받들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행을 멈추지 않는 상태가 된다.**
$=무참
- 무괴(無愧, anapatrapaya)
타인을 보고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무괴(無愧, anapatrapaya)라고 한다.
그래서 세간에서 꾸짖고 싫어하는 힘에 의지해서도 포악함과 악법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악행을 멈추지 않는 상태가 된다.**
$=무괴
*慚(부끄러울 참)
☞ ★★(唯識) 힉파는 ★★★(中隨惑)으로 다음 ★(二)가지를 나열한다.
★참(無慚, āhrīkya,) 무★(無愧, anapatrapaya)
이는 『★★론』(俱舍論)의 ★★★★(大不善地法) (2)와 같다.
$=유식, 중수혹, 2, 무괴(無愧) 구사, 대불선지법
【주석】---
【1】 무참 무괴의 구분은 참과 괴의 구분에 상응한다.
그런데 참과 괴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
- 참회 반성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참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괴는 <타인을 > 죄를 짓게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 K0105V09P0167c05L; ... 慚者自不作罪愧者不教他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제19권 8. 범행품 ⑤, 북량 담무참역(北涼 曇無讖譯), K0105, T0374 }
- 참회 반성의 <상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참은 <사람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
괴는 <하늘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北本大般涅槃經卷十九]
{ K0105V09P0167c07L; ... 慚者羞人愧者羞天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제19권 8. 범행품 ⑤, 북량 담무참역(北涼 曇無讖譯), K0105, T0374 }
- 한편 참회와 반성의 <방향>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다.
즉, 긍정적인 좋은 내용을 향하는 방향을 참이라고 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나쁨을 벗어나려는 방향은 괴라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구사론』에서는 다음 해석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여러 공덕 있는 자>를 높이어 <공경>하는 마음을 참(慚)이라고 한다.
반대로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괴(愧)라고 구분하는 입장이 있다.
{ K0955V27P0481c21L; ...有敬有崇有所忌難有所隨屬說名爲慚於罪見怖說名爲愧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4권 2. 분별근품 ②,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 한편 참회 반성의 <대상 및 계기>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다.
지은 죄 그 자체를 관찰하여 부끄러워함이 있는 것을 일컬어 ‘참’이라 하고,
다른 것(예: 그 과보)을 관찰하여 부끄러워함이 있는 것을 일컬어 ‘괴’라고 한다.
{ K0955V27P0481c23L; ... 第二釋於所造罪自觀有恥說名爲慚觀他有恥說名爲愧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제4권 2. 분별근품 ②, 존자세친조. 당 현장역(尊者世親造. 唐 玄奘譯), K0955, T1558 }
- 한편 참회 반성하게 만드는 <동인>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다.
자신과 법의 힘인가, 세간의 힘인가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자신과 법의 힘에 의지한다>
그래서 현인(賢人)과 선법(善法)을 받들고 존중한다.
그래서 잘못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고 악행을 멈추게 한다.
이를 참(慚)이라 한다.
한편 <세간에서 꾸짖고 싫어하는 힘에 의지한다.>
그래서 포악함과 악법을 거부한다.
그리고 잘못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고 악업을 멈추게 한다.
이를 괴(愧)라고 한다.
{ K0614V17P0552a10L; 是信云何爲慚依自法力崇重賢善... 『성유식론』(成唯識論), 제6권, 『성유식론』 6권(ABC, K0614 v17, p.551c01) 호법등보살조. 당 현장역(護法等菩薩造. 唐 玄奘譯), K0614, T1585
- 한편 참회 반성의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반성이 스스로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인가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지은 바를 반성해 돌보아 살핀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를 참(慚)이라 한다.
<타인을 상대하여 대할 때> 반성해 살핀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부끄러워한다. 이를 괴(愧)라고 한다.
즉, 참은 <내심으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괴는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K0105V09P0167c06L; ... 慚者內自羞恥愧者發露向人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제19권 8. 범행품 ⑤, 북량 담무참역(北涼 曇無讖譯), K0105, T0374 }
- 한편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사랑의 마음[愛애]과 반대되는 자재한 마음을 참(慚)이라고 한다.
수행과 공덕을 통해 어리석음[癡치]을 떠난다.
그래서 열등한 법을 혐오함을 괴(愧)라고 한다.
또는 3악도나 자타의 비방을 두려워함을 ‘괴’라는 입장도 있다,
{ K0957V28P0036b23L; ... 違愛等流心自在性說名爲慚... 『아비달마장현종론』(阿毘達磨藏顯宗論), 제5권, 변차별품(辯差別品)①, 존자중현조. 당 현장역(尊者衆賢造. 唐 玄奘譯), K0957, T1563 }
- 한편 참회 반성이 되는 <기초>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즉, 참회와 반성을 하게 되는 기초가 <직접 경험>인가 <간접 경험>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참회와 반성은 일정한 가치 선악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런 가치판단은 자신의 직접 경험을 기초로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또 간접 경험을 통해 살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간에서 다른 이의 경우를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나 다른 먼 곳의 사정도 찾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참과 괴를 구분할 수도 있다.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소수혹(소번뇌지법)
한편 특정한 경우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번뇌가 있다.
<특정한 염오심>에서 <특정한 인연>에 의해 발생하는 번뇌다.
여기에는 간(慳)ㆍ/교(憍)ㆍ/ 질(嫉)ㆍ한(恨)ㆍ분(忿)ㆍ해(害)ㆍ/ 뇌(惱)ㆍ부(覆)ㆍ첨(諂)ㆍ광(誑) 10번뇌를 나열한다. [소번뇌지법, 소수혹] 【1】
이를 <유식종>에서는 <소수혹>이라고 부른다.
<구사종>에서는 이를 <소번뇌지법>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두 <근본번뇌>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정한 염오심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대번뇌지법의 번뇌보다 그 폐해는 더 심할 수 있다.
유식학에서 <대수혹>과 <중수혹>은 모두 <견도>와 <수도>를 통해 끊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혹>은 <수도>의 과정으로 끊게 되는 번뇌로 보게 된다.
즉 수행을 통해 무명 어리석음을 끊어서 제거해나간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근본번뇌를 제거하는 방안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을 근본 번뇌 <탐ㆍ만ㆍ진ㆍ치>의 성격에 맞추어 위처럼 배열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근본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을 닦는다.
그리고 다시 개별적인 번뇌별로 <이를 제거할 방안>을 추가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살피기로 한다.
---
▣ 소수혹(小隨惑) (10) :
★★(特定)한 ★★★(染污心 kliṣṭa-citta)에서 특정한 인연에 의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번뇌를 ★★★(小隨惑)이라고 한다. **
여기에는 다음 ★★(一◯)가지를 나열한다.
간(慳, māṭsarya) 교(憍, mada) 질(嫉, īrṣyā) 한(恨, upanāha) 분(忿, krodha) 해(害, vihiṃsā) 뇌(惱, pradāśa) 부(覆, mrakṣa ) 첨(諂, māyā) 광(誑, śāṭya)
여기서 염오심은 번뇌에 물들어 오염된 마음을 가리킨다.
$=특정, 염오심, 소수혹, 10
소수혹(小隨惑) (10)
【주석】---
【1】 (참조 『아비달마구사론』 권21 分別隨眠品 第五之三 , 『입아비달마론』 권上)
【주석끝】---
♥Table of Contents
▣- 간(慳)
간(慳)은 집착하여 아끼는 마음이다. [慳간, māṭsarya]
자신이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재물과 법(진리, 정보)와 지혜, 기술, 재주 등이다.
그런데 이를 아낀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이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나누어주지 않는다.
이런 번뇌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일상생활에서부터 <가치 비교판단>을 잘 한다.
좋음을 아껴 기대하게 되는 <이익과 손해>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음을 아낌없이 베풀 때 얻는 <이익과 손해>가 있다.
이에 대해 통상 다음처럼 잘못 이해한다.
<좋음>을 아낀다.
그러면 그로 인해 당장 <그 좋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좋음이 <유지>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익>이 될 듯하다.
반대로 아끼지 않고 <좋음>을 베푼다.
그러면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을 듯하다.
그러나 이를 <넓고> <길고> <깊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넓게>, 자신과 다른 이, 그리고 온 생명의 입장을 고려한다.
또한 <길게>, 지금뿐 아니라 오래오래 나중까지, 그리고 무궁한 기간을 함께 고려한다.
한편, <깊게>,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특정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두루두루 고려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그런 경우 그 결과가 <반대>가 된다.
좋음을 아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좋음은 겨우 당장 <자신의 좋음>에 그치게 된다.
반대로 아끼지 않고 <좋음>을 베푼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이를 통해 <다른 생명>이 좋음을 얻는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 경우 좋음은 단순한 <자신의 좋음>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의 가치를 갖게 된다.
『유마경』에는 <무진등>의 설법이 나온다.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을 켠다.
그러면 <무량한 등불>을 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등불>을 켠다고 <그 등불의 불빛>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로 인해 그 <등불>이 밝아진다.
한편 <길게> 살핀다고 하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잘못된 단멸관>부터 제거해야 한다.
즉 <단멸관>은 다음 입장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과 관련된 것>은 없다.
<단멸관>은 이렇게 여기는 입장이다.
이는 자신의 <생사 윤회 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먼저 이런 잘못된 <단멸관>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무량겁>을 놓고 생사를 이어 길게 관한다.
<좋음>을 아낀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른 이>들도 이후 그를 돕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길게 살피면 <그로 인해 받는 손해>가 오히려 훨씬 크게 된다.
반대로 아끼지 않고 <좋음>을 베푼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이를 통해 <다른 생명>이 좋음을 얻는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난다.
한편 그런 경우 또 <다른 이>들이 그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반대로 돕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 자신도 <큰 결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도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
그래서 길게 살피면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오히려 훨씬 크다.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을 켜는 경우로 비유해보자.
이 경우 <자신의 등불>이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 꺼진다고 하자.
그래도 자신이 켠 <다른 등불>을 통해 곧바로 다시 켜질 수 있다.
한편 깊게 <각 항목이 갖는 측면>을 두루두루 서로 잘 비교한다.
그런 가운데 종합적으로 이를 헤아린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측면>에 집착해 아낀다고 하자.
예를 들어 <재산>에 집착해 재산을 아낄 수 있다.
그런 경우 또 <다른 측면> 예를 들어 명예, 지위 등이 손실을 받기도 한다.
한편 <재산, 명예, 지위> 등 어느 한 측면에 집착하고 아낀다고 하자.
그런데 그로 인해 <생명과 신체>를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생명과 신체의 가치>는 우주보다 가치가 크다.
그래서 당연히 생명과 신체는 500 조원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손실>이 더 크게 된다.
한편 <생계>를 해결하는 데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자.
이런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은 금액>은 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생계비에 해당한 30만원>이 <500조원>보다 더 가치가 크게 된다.
한편 생사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무한히 반복해 겪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생명이나 생존 자체>를 포기하려 하게 된다.
따라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남이 갖는 가치는 대단히 크다.
그래서 <각 측면>>이 갖는 이런 사정을 미리 잘 헤아린다.
그런데 좋음을 베품은 기초적으로 3악도 생사고통을 벗어나는 수행이 된다.
이로 인해 그간 쌓은 업의 장애가 제거된다.
그래서 3악도의 생사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3악도의 생사고통을 벗어나 하늘에 이르는 기초 수행이 된다. [인천교]
한편, 수행자는 이런 기본 상태에서 다시 번뇌를 제거해 완전히 생사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다시 계ㆍ정ㆍ혜 3학의 수행을 닦게 된다.
이런 수행과정에서 수행자는 좋음을 베풀고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계의 핵심이 된다.[성계]
이런 수행으로 역시 업의 장애를 제거한다.
그리고 업을 통해 가해 피해 관계로 생사에 묶이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생사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 [아라한의 회신멸지 무여열반]
한편, 생사현실에서 다른 중생을 생사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을 갖는 경우가 있다. [대승보살 수행]
이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을 제도할 수단과 방편을 갖추어야 한다.
즉, 수행자는 생사현실 안에서 복덕자량과 지혜 자량이 구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좋음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즉, 수행자는 얻을 바 없음을 방편으로 보시를 행해야 한다. [보시바라밀다]
그리고 계를 구족해야 한다. [정계바라밀다]
이런 수행을 통해 먼저 업장을 예방하고 제거한다.
그것이 다 제거되면 이후 이는 수행자의 복덕자량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덕자량으로 이후 중생을 원만히 제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는 <좋음>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생명을 차별 없고 제한 없이 오래오래 두루두루 좋게 이끈다.
그러한 광대무변한 <서원>을 갖고 수행에 정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
좋음을 아끼는 것은 스스로 3악도 생사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업의 장애를 제거하지 못하고 생사에 묶인다.
그리고 또 다른 중생을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함에도 장애를 겪게 된다.
이처럼 손실이 많다.
이에 반해 좋음을 아끼지 않고 널리 베품이 훨씬 가치가 많다.
이런 사실을 이해해서 좋음을 아끼는 마음[慳간]을 제거해야 한다.
---
간(慳, māṭsarya)
인색하여 집착하여 아끼는 마음을 ★(慳, māṭsarya)이라 한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되는 것을 베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다.**
$=간,
♥Table of Contents
▣- 교(憍)
교(憍)는 만(慢)과도 비슷하다. [교憍, mada]
만(慢)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교는 스스로 <자신의 장점>에 대해 그릇되이 집착한다.
그리고 마음이 오만 방자하게 된다.
그래서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다.
<교>는 이와 같은 마음의 번뇌다.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부처님이나 <뛰어난 스승>이 갖춘 덕을 늘 마음에 둔다.
그래서 <뛰어난 덕>에 따라 기뻐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자신도 원하고 희망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그려가며 좋아한다.
한편, 이런 <부처님의 덕성>에 비추어 <부족한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부족한 단점>을 생각한다.
한편, 자신이 어떤 <공덕>이나 <덕성>을 갖추었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것이 <자신 혼자의 힘>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님을 헤아린다.
<다른 생명>이 없다고 할 때 그런 성취가 가능하지 않음을 헤아린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준 다른 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공덕>을 되돌린다.
그리고 <더 높은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런 수행 자세에 스스로 <긍지>를 갖는다.
---
교(憍, mada)
스스로 자신의 장점에 대해 그릇되이 집착하여, 오만 방자한 마음을 ★(憍, mada)라고 한다.
그래서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은 더 이상 향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만(慢)은 이와 비슷하나 만(慢)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가운데 일으키는 마음이다.**
$=교
♥Table of Contents
▣- 질(嫉)
질(嫉)은 남의 선과 좋음에 대하여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시기하고 꺼리는 마음이다. [질嫉, īrṣyā]
현실에서 각 개인이 좋음을 추구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건강, 장수, 즐거움, 지혜, 지식, 아름다움, 인격, 지위, 명예, 인간관계, 부, 권력,.. 등등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각 측면에서 서로 간에 다른 이의 상태를 살핀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와 비교한다.
또한 선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질의 번뇌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좋음을 단순한 좋음과 선으로 구분해 대해야 한다.
좋음에는 단순히 자신 입장에서만, 지금 순간만, 그리고 한 측면만 좋은 경우가 있다.
반면, 넓게 자신 뿐 아니라 온 생명이 차별없고 제한없이 좋고,
길게 지금 뿐 아니라 오래오래 무궁히 좋고,
깊게 한 측면 뿐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측면이 좋은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한 좋음과는 구분된다.
그래서 이를 이상적인 선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모두 좋은 것은 대단히 이상적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완전히 이상적인 상태를 얻기는 곤란할 수 있다.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 결여되면 그 만큼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선의 상태는 수행자가 향해 나아갈 방향이다.
그리고 단순한 좋음과 이런 상태를 구분해 대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이가 선을 행하고 수행을 향해 나아다.
또 그런 일을 잘 성취한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그에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수희]
이런 경우 단순히 그처럼 따라 기뻐하여 얻는 공덕이 무량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선의 결과를 함께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한편 자신도 그런 성취가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도 그런 서원을 일으킨다. [원요]
그래서 노력한다.
그래서 원만히 성취를 한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런 자세로 질의 번뇌를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편, 현실에서 이런 선이 아니고 어느 한 측면만 좋은 경우라고 하자.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다투다가 갑이 승리하는 경우와 같다.
그런 경우 무조건 어느 한쪽을 따라 기뻐할 일은 아니다.
올바른 선과 수행의 성취가 아닌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잠시 한 측면만 좋다.
그런 경우 넓고 길고 깊게 살피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한다. [비]
그리고 이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편 어떤 이가 가치 없는 측면에서 약간의 좋음을 얻는다.
그런 경우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별 없이 마음에서 버린다. [사]
그런 가운데 자신의 서원에 집중해 나아가는 것이 낫다.
한편 선악과 무관한 가운데 좋음을 얻는 경우라고 하자.
예를 들어 수학시험에 다른 이는 100점을 맞았다.
그리고 자신은 50점을 맞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 스스로 자신 성적에 불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을 다시 다른 이와 비교한다.
그런 경우 이런 상대적 비교로 불만을 더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을 생각한다.
그래서 질의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우선 이 경우 상대의 좋은 성적이 자신의 불쾌한 상태를 만들어준 것처럼 여기기 쉽다.
그리고 자신의 낮은 성적은 마치 상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그런 불쾌를 만들어 준 상대에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심하면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까지 일으킨다.
그리고 다른 이가 나쁜 상태에 처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른 이가 불행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런 상태에 처한다고 하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오히려 이를 기뻐하기 쉽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기 쉽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상대만 없어지면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성적이 낮은 것은 상대의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낮은 성적은 다른 이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곤란하다.
이런 경우 자신이 성적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뿐이다.
이런 경우 상대를 해치고 끌어내려 상대도 50점을 맞게 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자신의 수학점수가 100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자신이 비교하는 측면은 꼭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측면마다 모두 그런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 전 방위에서 이런 마음 상태로 임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에 모두 자신보다 못한 상태만 있다고 하자.
그것은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이가 좋음을 얻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임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지 그 좋음이 단순한 좋음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선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嫉, īrṣyā)
남의 잘되는 일에 대하여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꺼리는 마음을 ★(嫉, īrṣyā)이라고 한다. **
결국 질(嫉)은 질투심을 뜻한다.
$=질
♥Table of Contents
▣- 한(恨)
노여움을 일으킬 일이 있다.
그런데 한(恨)은 이런 경우 이를 자주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원망하며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뜻한다. [한恨, upanāha]
이런 한(恨)의 번뇌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분노를 제거하는 일반 방안이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경우 기초수행의 5정심관의 자비관도 도움이 된다.
또 분노를 제거하는 일반방안도 도움된다.
[참고 ▣- 5정심관]
[참고 ▣- 탐욕과 분노에 대한 집착의 제거]
과거가 원망스럽다고 하자.
그러나 현실 어떤 한 단면에도 결정되고 고정된 내용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해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평안히 임하도록 노력한다.
아런 경우 기본적으로 망집에 바탕해 현실에서 상을 취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또 다른 부분을 취해 영희나 철수로 여긴다.
그런데 이처럼 상을 취하는 자세가 망상분별이다.
이런 사정을 먼저 잘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또 현실에서는 모든 이가 다 과거 생에 자신의 부모였음을 관한다.
또는 현실에서 모든 이를 자신과 가까운 인연으로 여긴다.
그리고 좋음과 은혜를 주고받는 이로 여긴다.
그래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다.
또 모든 이들이 장차 다 함께 최고의 상태가 되고 성불할 수 있음을 헤아린다.
즉 지금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재는 장래 무량겁 후에 성불하는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라고 관한다.
그리고 존중한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
그리고 일단 상대 입장에 공감해보려 노력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내용을 찾아본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붙잡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들 모두를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
또 현실에서는 하나의 상태에서 수행에 도움되는 좋은 측면을 취해 대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인과를 잘 살핀다.
그리고 과거를 반성한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게 된다.
그래서 훨씬 이익이 늘고 손해가 줄게 된다.
그리고 안좋은 상태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더 행한다.
한편 이미 발생한 나쁜 상태에 대해서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번 나쁜 내용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 되돌릴 수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이를 변경하기도 힘들다.
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그 방안으로 지금 이 현재 순간을 변경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물이 엎질러졌다고 하자.
그런 경우 과거로 돌아가 물을 처음부터 엎질러지지 않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엎질러진 물을 걸레로 닦는 것이 도움된다.
한편, 과거에 예를 들어 염산과 같은 독극물이 쏟아졌다.
이 경우에도 과거를 돌아가 처음부터 없던 상태로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같은 양의 알칼리를 쏟아 붓는다.
그러면 과거의 내용까지 함께 중화된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없었던 상태와 같아진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의 나쁜 내용을 반복해 살피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다.
지금 어떤 노력을 하면 그것이 더 좋게 될 것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또 어떻게 해야 장차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될지 예방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
결국 이런 경우는 4의단의 수행방안이 도움된다.
이미 있는 악은 더 키우지 않는다.
없는 악은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이미 있는 선을 키운다.
없는 선은 새로 만든다.
이런 자세가 효과적이다.
---
한(恨, upanāha)
원망의 마음을 갖고 이를 간직하며 버리지 않는 마음을 ★(恨, upanāha)이라고 한다.**
즉, 분한 마음을 마음에 남겨 두고 이를 자주 떠올려 생각하는 마음이다.
$=한
♥Table of Contents
▣- 분(忿)
분(忿)은 생명이나 무생물에 분개를 일으키는 것이다. [분忿, krodha]
분(忿)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기초수행의 5정심관의 자비관도 도움이 된다.
또 분노를 제거하는 일반방안도 도움된다.
[참고 ▣- 5정심관]
[참고 ▣- 탐욕과 분노에 대한 집착의 제거]
그리고 앞 항목 한(恨)에서의 방안은 여기에도 그대로 공통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도움된다.
---
분(忿, krodha)
거슬리는 역경계에 대하여 싫어하는 가운데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忿, krodha)이라 한다.**
$=분
♥Table of Contents
▣- 해(害)
해(害)는 타 생명[有情]을 괴롭게 만들고 해치는 것이다.[해害, vihiṃsā]
해(害)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기초수행의 5정심관의 자비관도 도움이 된다.
또 분노를 제거하는 일반방안도 도움된다.
[참고 ▣- 5정심관]
[참고 ▣- 탐욕과 분노에 대한 집착의 제거]
그리고 한(恨)과 분(忿)의 항목에서 살핀 내용이 함께 도움된다.
자신이 탐욕에 집착하고 급급하다.
그런 경우 다른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런 경우 인과를 넓고 길고 깊게 헤아린다.
그래서 어떤 업으로 어떤 과보를 되돌려 받는가를 잘 헤아린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이익과 안락함을 얻게 되는가를 헤아린다.
상대가 고통과 악을 행한다.
이런 경우 이에 대해 보복하고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
이런 경우 먼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상대의 가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편, 상대가 이미 악을 행했다.
이런 경우 상대를 보복해 해친다고 하자.
그로 인해 자신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가 좋은 상태로 변화되지 않는다. .
원한은 원한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또 보복과 해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죽었다.
그래서 이에 보복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들의 사체를 수북이 위에 쌓아 올린다.
그런다고 처음 죽은 이가 다시 좋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 상태가 된다.
일단 그부터 무겁게 깔린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그에 다른 과보가 함께 뒤따른다.
그래서 고통이 더 증폭된다.
한편 그런 보복을 통해서는 상대가 좋은 상태로 개선되지 않는다.
대부분 이에 대해 상대가 반발한다.
그리고 상대는 이후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다.
그런 가운데 이후 서로 가해와 피해관계를 반복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악과 고통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먼저 잘 이해한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이를 제거하는 방편이 된다.
이런 경우 우선 그에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평안하게 그 상태를 참고 견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부터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임한다.
또 피해를 받았어도 이를 더 키우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한편 그 상대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그래서 상대가 다시 악행을 행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실에는 일반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부터 관찰한다.
그래서 그 직전에 어떤 상태일 때 그처럼 잘 행하는가를 다시 관찰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비심을 갖는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
공감을 갖는다.
그런 경우에는 올바로 잘 행한다.
그래서 다시 어떤 상태가 되면 상대가 그런 자비심 등을 갖는가를 또 살핀다.
그래서 상대가 그런 상태로 변화하도록 노력해간다.
---
해(害, vihiṃsā)
남을 괴롭히고 이익을 뺏고 손해(損害)를 주며 해치려는 마음을 ★(害, vihiṃsā)라고 한다.**
$=해
♥Table of Contents
▣- 뇌(惱)
뇌(惱)는 번민하는 상태를 뜻한다. [뇌惱, pradāśa]
스스로 잘못임을 안다.
그러나 타인이 반성을 권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을 번민한다.
이런 상태다.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주로 번민은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으킨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도 이와 관련된다.
이런 경우 경험이 많은 이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이 이미 잘 정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그런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자.
현실에서 각 내용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각 선택에 따른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런 경우 어떤 결정을 확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만 놓고 번민 갈등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 경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진척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실천노력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낫다.
즉, 일단 가장 좋은 상태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방향을 찾는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실천을 시작한다.
물론 처음에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 점차 지혜를 얻는다.
한편,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떤 극단적인 경우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실 일체가 본래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한다.
그리고 다시 그런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노력을 행한다.
그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 사후 대처할 방안도 함께 준비한다.
그런 경우 그 이하 나머지는 일일히 헤아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 경우 내용이 불투명해도 일단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실천 노력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방안이 방편이 될 수 있다.
---
뇌(惱, pradāśa)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며 번민하는 상태를 ★(惱, pradāśa)라고 한다.
과거에 분하게 여기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거나, 현재의 사물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잘못임을 알더라도, 반성하지 않는다.
$=뇌
♥Table of Contents
▣- 부(覆)
부(覆)는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고 숨김을 말한다.[부覆, mrakṣa]
명예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진실이 갖는 힘을 생각한다.
허위는 잠시 상대를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허위인 사정으로 그것이 오래갈 도리가 없다.
또 그런 연유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처음 속였던 효과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더욱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헤아린다.
그래서 진실한 바탕에서 임해야 한다.
비록 진실이 희망에 들어맞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진실에 바탕한다.
또한 본래 일체가 그 본 바탕이 차별없이 청정함을 관한다.
다만 망집을 바탕으로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생사현실이 본래 차별없이 공하고 살딥지 않음을 관한다.
그리고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집착없이 참괴의 자세로 임한다.
그런 자세가 생사현실 안에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죄악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참괴한다.
물론 그것은 잠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가장 적은 고통이다.
그래서 그것을 평안히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것을 평안이 참고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과보는 이보다 훨씬 더 고통을 주게 된다.
그리고 역시 더 극복하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다시 선한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추구한다.
그래야 성취가 원만히 된다.
그리고 그 상태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
부(覆, mrakṣa )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고 숨김을 ★(覆, mrakṣa )라고 한다.**
$=부
♥Table of Contents
▣- 첨(諂)
속마음을 숨긴다.
그리고 아양을 부린다.
그러면서 비위를 맞춘다.
이를 첨이라고 한다.[첨諂, māyā]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역시 진실이 갖는 힘을 생각해야 한다.
상호간의 관계는 진실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가운데 상대를 포함해 온 생명을 오래 두루두루 좋게 하려는 서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성취 방안을 올바로 찾아 실천한다.
---
첨(諂, māyā)
속마음을 감춘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게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마음을 ★(諂, māyā)이라고 한다.**
$=첨
♥Table of Contents
▣- 광(誑)
광(誑)은 다른 이를 유혹하거나 속이려는 마음이다. [광誑, śāṭya]
이를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역시 진실이 갖는 힘을 생각한다.
부(覆)와 첨(諂) 항목에 살핀 내용에 준해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광(誑, śāṭya)
거짓을 꾸며 다른 이를 속이거나 유혹하는 마음을 ★(誑, śāṭya)이라 한다.**
$=광
☞ ★★(唯識) 힉파의 ★★★(小隨惑)은 다음 ★★(一◯)가지다.
★(慳, māṭsarya) ★(憍, mada) ★(嫉, īrṣyā) ★(恨, upanāha) ★(忿, krodha)
★(害, vihiṃsā) ★(惱, pradāśa) ★(覆, mrakṣa ) ★(諂, māyā) ★(誑, śāṭya)
이는 『★★론』(俱舍論)의 소번뇌지법 ★★(一◯)가지와 같다.
$=유식, 소수혹 10 간교 질한분해 뇌부첨광(慳憍 嫉恨忿害 惱覆諂誑) 구사 소번뇌지법 10
▲▲▲-------------------------------------------
● 아상의 부분은 이후 <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에서 편집할 것 불기2569-06-04
내용이 중복된다.
따라서 통합해서 살핀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후 관련된 부분에 붙이기로 한다.
** 본 파일은 직접 편집하지 않는다
$ 246~280
<통합해서 살피는 장소> 인터넷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링크는 아래 부기]
불교개설서연구/08장_2유식_2_5위백법.txt
cf 부파불교
< 관련부분 > 기초아함경연구/잡아함경_200.txt
< $ 246~280 까지 정리후 다시 원 위치에 붙일 것 >
-------------------------------------------
♥Table of Contents
▣- 근본번뇌의 수행단계별 분류
근본 10번뇌를 수행단계별로 좀 더 세분해 나열하기도 한다.
그래서 구사종에서는 98사를 나열한다.
한편 유식종에서는 128사를 나열한다.
이런 번뇌 분류는 10가지 근본번뇌를 4제법과 3계별로 배당한다.
따라서 조금 번잡하다.
다만 수행계위로 예류과ㆍ일래과ㆍ불환과ㆍ무학과 등을 구분할 때 도움이 된다.
한편 이들 숫자의 차이는 다음 사정에 연유한다.
먼저 번뇌 가운데 분노[진瞋)은 색계ㆍ무색계에 나열하지 않게 된다.
그런 가운데 구사종에서는 총 98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98사]
먼저 견도를 통해 끊는 10번뇌가 있다. [신견ㆍ변견ㆍ사견ㆍ견취견ㆍ계금취견ㆍ탐ㆍ진ㆍ치ㆍ만ㆍ의]
이를 다시 4제법과 3계로 나누어 배당한다.
먼저 욕계에서 4제법으로 끊을 번뇌를 다음처럼 세분한다.
즉 고제(苦諦)를 통해 끊을 번뇌로 10번뇌를 나열한다.
집제(集諦)로 끊을 번뇌로 7번뇌만 나열한다.
그리고 멸제(滅諦)를 끊을 번뇌도 7번뇌만 나열한다.
이는 10번뇌에서 신견(身見)ㆍ변견(邊見)ㆍ계금취견(戒禁取見)을 제외한 내용이다.
도제(道諦)로 끊을 번뇌로는 8번뇌를 나열한다.
이는 10번뇌에서 신견(身見)ㆍ변견(邊見)을 제외한 내용이다.
그래서 욕계는 총합 32번뇌가 된다.
예를 들어 10번뇌 가운데 신견(身見)은 견고소단에만 배당된다.
그러나 사견(邪見)은 견고소단ㆍ견집소단ㆍ견멸소단ㆍ견도소단에 모두 배당한다.
이런 식으로 배열한다.
한편 색계ㆍ무색계는 위 내용에서 각기 진(瞋)항목을 뺀다.
따라서 각기 28 번뇌씩이 된다. [ 총 88사= 32+28+28]
한편 수행을 통해 끊는 번뇌로 구사종에서는 탐ㆍ진ㆍ치ㆍ만 4 번뇌만 든다.
그리고 이를 3계에 배당한다.
역시 색계, 무색계는 각기 진(瞋)항목을 뺀다.
그래서 10번뇌를 나열한다. [총 98사=88+10]
한편 유식종에서는 총 128 종류를 나열한다. [128사]
먼저 견도를 통해 끊는 10번뇌가 있다.[신견ㆍ변견ㆍ사견ㆍ견취견ㆍ계금취견ㆍ탐ㆍ진ㆍ치ㆍ만ㆍ의]
이를 다시 4제법과 3계로 나누어 배당한다.
유식종에서는 이 경우 112번뇌를 든다.
즉 욕계 고ㆍ집ㆍ멸ㆍ도에 각기 10번뇌를 배당한다.
그래서 40번뇌를 나열한다.
한편 색계 무색계는 여기에서 진(瞋) 항목만 뺀다.
그래서 36번뇌씩이 된다. [총 112사=40+36+36]
한편 수행을 통해 끊는 번뇌가 있다.
이에 대해 유식종에서는 탐ㆍ진ㆍ치ㆍ만ㆍ구생기신견ㆍ구생기변견 6 번뇌를 든다.
그리고 이를 3계에 배당한다.
역시 색계ㆍ무색계는 각기 진(瞋)항목을 뺀다.
그래서 16번뇌를 나열한다. [총 128사=112+16]
한편 수혹(修惑)은 성질이 지둔(遲鈍) 애매하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먼저 각 생명이 머무는 장소(場所)ㆍ경지(境地) 또는 계위(階位)를 9지(九地)로 나눈다. [3계9지三界九地)]
한편 욕계의 지옥ㆍ아귀ㆍ축생ㆍ인간ㆍ천상의 5취를 합하여 욕계5취지(欲界五趣地) 1지로 묶는다.
그리고 색계의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ㆍ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ㆍ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ㆍ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ㆍ
무색계의 공무변처지(空無邊處地)ㆍ식무변처지(識無邊處地)ㆍ무소유처지(無所有處地)ㆍ비상비비상처지(非想非非想處地)를 나열한다.
그리고 이들 9지(地)의 각 위에 단순히 9품(品)의 구별을 벌려 세운다.
여기서 9품은 수혹의 강약의 정도에 따라 단순히 나눈 것이다.
즉, 상상품(上上品)에서 하하품(下下品)까지의 9품계(品階)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를 수혹(修惑) 81품(品)이라고 부른다.
또는 9지(地) 9품(品)의 사혹(思惑)이라고 한다.
한편 이를 다시 9지의 탐ㆍ진ㆍ만ㆍ의 각각에 배당한다.
그래서 전체 252수혹을 말하기도 한다.
[4(탐ㆍ진ㆍ만ㆍ의)*1(욕계1자)*9 + 3(탐ㆍ만ㆍ의)*8(색계4지ㆍ무색계4지)*9]
그리고 이들 번뇌를 끊어 나간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다음 수행단계가 나열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의 3도-견도ㆍ수도ㆍ무학도
수행의 3 단계로 견도(見道)ㆍ수도(修道)ㆍ무학도(無學道)를 나열한다.
여기서 도(道 mārga)는 니르바나에 이르는 수행의 방법, 길[통로通路], 단계를 의미한다.
처음 견도에서는 4제법의 내용을 관한다. [견도見道, darśana-mārga]
이는 4제의 진리를 보는 단계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견제도(見諦道)라고도 한다.
그래서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
이 단계에서 온갖 지적인 미혹[迷]를 벗어난다.
그리고 견도를 성취한 이를 성인 또는 성자라 부른다.
이후 수도의 과정이 있다. [수도修道 bhāvanā-mārga]
이 단계에서는 견도에서 얻은 진리를 반복하여 닦아 익힌다.
그리고 정(情)ㆍ의(意)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끊어 간다.
일래향에서 아라한향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 3계의 수혹(修惑)을 끊어간다.
대승에서는 초지에서 제10지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는다.
이후 수행자의 수행이 완료된다.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지위에 이른다.
이를 무학도라고 한다. [무학도無學道, aśaiksa-mārga]
♥Table of Contents
▣- 4향4과
수행단계에 견도ㆍ수도ㆍ무학도가 있다.
그런데 이는 다시 4향4과로 세분해 나누기도 한다.
먼저 견도에 예류향(預流向)ㆍ예류과(預流果)가 있다.
수도에는 일래향(一來向)ㆍ일래과(一來果)ㆍ불환향(不還向)ㆍ불환과(不還果)ㆍ아라한향(阿羅漢向)이 있다.
그리고 무학도에 아라한과가 있다.
이를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예류향
처음 4제법을 닦아 3계에서 이치적 번뇌[견혹見惑]을 끊어간다.
이런 견혹을 끊어가는 수행과정을 견도(見道)라고 한다.
이 견도에는 16심을 나열한다.
이 경우 15심 단계까지를 예류향이라 한다. [예류향預流向 srota āpatti]
예류향은 예류과를 향해 가는 단계다.
그래서 이는 성자(聖者)의 대열에 합류해 가는 수행 과정이다.
16심에서는 각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먼저 관찰할 4제법은 고ㆍ집ㆍ멸ㆍ도가 된다.
이 경우 먼저 욕계의 내용을 관한다.
이를 고법ㆍ집법ㆍ멸법ㆍ도법이라 칭한다.
그리고 이후 색계ㆍ무색계의 내용을 관한다.
이들은 욕계에서 얻은 지혜와 '동류'가 된다.
따라서 이는 유(類)를 붙인다.
그래서 고류ㆍ집류ㆍ멸류ㆍ도류로 칭한다.
그리고 한창 번뇌[혹惑]을 끊어 가는 지위는 지인(智忍)이라 칭한다.
그리고 이미 번뇌를 끊어 마친 지위를 지(智)라 칭한다.
그래서 16심에 다음의 단계가 나열된다.
1. 고법지인(苦法 智忍). 2. 고법지(苦法 智). 3. 고류지인(苦類 智忍). 4. 고류지(苦 類智).
5. 집법지인(集法 智忍). 6. 집법지(集法 智). 7. 집류지인(集類 智忍). 8. 집류지(集 類智).
9. 멸법지인(滅法 智忍). 10. 멸법지(滅法 智). 11. 멸류지인(滅類 智忍). 12. 멸류지(滅 類智).
13. 도법지인(道法 智忍). 14. 도법지(道法 智). 15. 도류지인(道類 智忍). 16. 도류지(道 類智).
이는 결국 16심(心)으로 욕계ㆍ색계ㆍ무색계의 4제(諦) 이치를 관찰함을 말한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제거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자(聖者)라 칭하는 지위가 된다.
그래서 16심 전체를 견도라고도 한다.
한편 16심은 수도에 들어가는 단계다.
따라서 제15심까지만 견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Table of Contents
▣- 예류과
예류향의 상태에서 3결을 끊는다고 하자.
여기서 3결은 신견ㆍ계금취견ㆍ의(疑)를 말한다.
그러면 예류과의 상태가 된다.
(『증일아함경』 제16권 『잡아함경』 제34권, 『아비달마구사론』 제21권)
그러나 한편 예류과에 이른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통해 견혹은 다 끊어진 상태로 본다.
즉, 신견ㆍ계금취견ㆍ의를 끊으면 곧 나머지 견혹 일체도 다 끊어진 상태로 간주된다.
3계의 4제를 관찰하는 단계로 16심을 나열한다.
이 16심에서 제16심 단계에 이르면 예류과라고 칭한다.
제16심에서는 견혹을 다 끊고 수도에 들어간다.
즉, 정서적 의지적 번뇌[수혹修惑]를 끊는 수행과정[修道]을 시작한다.
따라서 이는 수도위(修道位) 처음이 된다.
그리고 견도와 수도 둘을 갖춘 최초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제16심만은 따로 수도(修道)라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성문 4과의 제1과로서 성인의 지위에 오른 상태다.
이는 욕계 인간세계와 천상을 7번 오가는 사이 최종 열반을 증득할 수준이다. [극칠반유極七返有]
이를 예류과라고 칭한다. [예류과預流果, 수다원須陀洹, srota āpatti-phala]
대승 유식종(唯識宗)에서는 이는 5위 중 통달위(通達位)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유식(唯識)의 성품인 진여의 이치를 체득한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장(煩惱障)ㆍ소지장(所知障)의 종자를 끊는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춘 번뇌장의 활동을 아주 누르는 단계다.
대승 10지(地)에서는 처음 환희지에 해당한다.
♥Table of Contents
▣- 일래향
예류과에 이른 이후 수혹[탐ㆍ진ㆍ치ㆍ만ㆍ구생기신견ㆍ구생기변견]을 끊어간다.
이들 수혹 가운데 욕계(欲界)의 수혹(修惑) 9품 가운데 5품의 번뇌를 끊은 상태다.
그래서 일래과를 향해 가는 상태다.
이를 일래향이라 칭한다. [일래향一來向, sakṛd-āgāmi-pratipannaka]
일래향은 욕계 인(人)ㆍ천(天)을 3 번 왕래하는 사이에 열반을 증득할 수준이다. [가가성자家家聖者, 천가가天家家, 인가가人家家]
♥Table of Contents
▣- 일래과
욕계(欲界)의 수혹(修惑) 9품(品) 중 6품을 끊은 상태를 일래과라고 한다. [일래과一來果, 사다함과斯陀含果, sakṛd-āgāmi-phala]
이 경우는 욕계의 수혹이 상당히 조복된 상태다.
다만 아직 나머지 3품의 번뇌가 있다.
그래서 이를 끊기 위하여 천계(天界)에 태어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인간계에 태어난다.
그 후 열반을 증득할 수준이다.
또는 일래과를 다음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예류과에 이르러 3결[신견ㆍ계금취견ㆍ의疑]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수혹 가운데 탐ㆍ진ㆍ무명을 조복한다.
이런 상태를 일래과라고도 설명한다.
♥Table of Contents
▣- 불환향
일래과 이후 욕계의 제7품ㆍ제8품 수혹(修惑)을 끊는다.
그런 경우 불환과를 향해 가는 단계가 된다.
따라서 이를 불환향이라고 칭한다. [불환향不還向, anāgāmi-pratipannaka]
♥Table of Contents
▣- 불환과
욕계의 9품 수혹(修惑)을 다 끊는다.
그래서 욕계 수혹은 남은 것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경우 다시 욕계에 돌아와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색계ㆍ무색계에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를 불환과라고 칭한다. [불환과不還果, 아나함阿那含, anāgāmin / anāgāmi-phala]
불환과는 5하분결(五下分結)의 단멸 상태로 설명하기도 한다.
5하분별은 3결[유신견ㆍ계금취ㆍ의]에 욕탐(欲貪),진에(瞋恚)를 더한 내용이다. [오하분결五下分結 pañca avarabhāgiyāni saṃyojanāni]
이는 욕계의 번뇌 속박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 어느 단계에서 열반에 드는가에 따라 다시 여러 구분을 세운다. [5종불환/ 7종불환不還]
예를 들어 욕계로부터 색계에 가는 도중의 중유(中有) 상태에서 무학과(無學果) 열반을 증득하는 경우도 있다. [중반中般]
또는 색계에 태어난 뒤에 곧 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다. [생반生般]
또는 색계에 태어나서 오래 수행한 뒤에 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다. [유행반有行般]
또는 색계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수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랜 시기를 지난 뒤에야 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다. [무행반無行般]
또는 색계에 태어난 후 그 이상의 하늘에 나서 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다. [상류반上流般].
또는 욕계에서 바로 무색계에 나서 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다. [무색반無色般]
또는 욕계에서 그 몸으로 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다. [현반現般]
『잡아함경』에서는 여러 형태의 열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욕유루[욕계에서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그리고 유유루[색계ㆍ무색계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또 무명유루[3계의 어리석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그리고 해탈한 줄을 알고 보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만일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법을 탐하고 법을 기억하며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반열반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만일 또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생반열반을 취한다.
만일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혹은 유행반열반을 취한다.
또 만일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혹은 무행반열반을 취하기도 한다.
또 만일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상류반열반을 취한다.
또 만일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는 곧 법을 탐하고 법을 기억하며 법을 좋아한 공덕 때문에 자성광음천(自性光音天)에 태어난다.
또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량광음천(無量光音天)에 태어난다.
또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광천(少光天)에 태어날 것이니라.
...
참조 『잡아함경』 0868. 해탈경(解脫經)
이는 수행자가 욕계를 떠나 열반을 얻는 단계를 설한 내용이다.
불환과는 대승불교의 10지 중 제8지인 부동지(不動地)에 도달한 상태로도 제시된다.
한편, 유식유가행파에는 뢰야3위(賴耶三位)를 든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인 선악업과위(善惡業果位)로 들어선 경지라고도 설명한다.
즉, 첫 번째인 아애집장현행위(我愛執藏現行位)를 벗어난 상태다.
♥Table of Contents
▣- 아라한향
아라한향은 불환과를 얻고난 이후 아라한과를 향해 수행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아라한향이라고 한다. [아라한향阿羅漢向, arhattva-pratipannaka]
이는 색계ㆍ무색계의 수혹[탐ㆍ만ㆍ치ㆍ구생기신견ㆍ구생기변견]을 끊어가는 단계다.
한편 일래향(一來向)부터 이 아라한향(阿羅漢向)까지를 수도(修道)의 기간으로 본다.
♥Table of Contents
▣- 아라한과
아라한과는 현생에서 3계(三界)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은 상태다. [아라한과阿羅漢果, 무학無學, arhattva ; arhat-phalin]
그래서 열반을 증득하는 상태다.
이를 5상분결이 단멸된 상태로 설명하기도 한다.
5상분결은 색탐ㆍ무색탐ㆍ도거ㆍ만ㆍ무명을 말한다.
이는 중생을 색계(色界)ㆍ무색계에 결박하여 해탈치 못하게 하는 5종의 번뇌다.
아라한과에 이른다고 하자.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무학위(無學位)라고 부른다.
한편 이 이전 단계는 통칭하여 유학위(有學位: 배울 것이 있는 계위)라고 한다.
♥Table of Contents
▣- 아라한과 대승 보살의 수행[<생사 즉 열반관>]
생사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먼저 망상분별에 해당하는 견해의 번뇌를 제거한다.
또 정서적 의지적 번뇌도 제거한다.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도 제거한다.
이는 분별로 일으키는 번뇌보다 훨씬 뿌리 깊다.
그러나 이 번뇌도 역시 기본적으로 망상분별을 제거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한편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자신부터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생사현실에 묶여 있는 다른 이들도 구해내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는 그가 자비심을 갖고 중생을 대하기 때문이다.
다른 중생은 스스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혼자 벗어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수행자는 중생이 생사고통을 받아가는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임한다.
그런 가운데 복덕과 지혜자량을 구족한다.
그래서 이 측면은 기본적 수행과는 성격이 다르게 된다.
병에 걸린 환자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자신의 병이 나아 퇴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 환자는 퇴원을 목표로 병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환자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다른 병자를 치료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가 환자가 걸린 병에 걸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 먼저 환자처럼 노력해 일단 병이 나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병만 낫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자신의 병 뿐 아니라 환자들의 수많은 병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치료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정에서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처음 수행자는 자신부터 일단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 수행이 기본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생사 묶임에서 벗어난다고 하자.
그래서 깨달음[보리]에 바탕해 생사현실을 관한다.
그런 경우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중생들이 망집을 일으켜 임한다.
그래서 본래 얻을 수 없는 생사고통을 받아 나감을 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중생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다시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갖는다. [보리심]
그래서 이를 위한 수행이 다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서로 전체적으로 관련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처럼 묶어 볼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업과 집착의 기본적 제거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평소 이들 내용을 실답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업을 행한다.
이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따라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먼저 계를 성취한다.
그런 가운데 이런 업을 잘 끊어야 한다.
한편 망상분별에 바탕해 집착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집착이 업을 행하게 한다.
따라서 먼저 집착을 일단 제거한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이 관한다.
이들은 모두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변화하고 무상한 것이다. [무상]
=> 따라서 집착을 갖고 대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고통에 귀결된다. [고]
=> 따라서 집착을 갖고 대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참된 실체인 자신은 없다. [무아]
즉, 자신에 진짜로 고정되고 영원한 뼈대가 되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다른 세상 내용도 사정이 같다.[무자성]
=> 따라서 집착을 갖고 대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본래 본바탕 실재는 생멸 및 생사 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 일체는 본래 생사고통을 벗어난 니르바나다. [열반적정]
=> 따라서 현실은 집착을 갖고 대할만한 것이 아니다.
한편, 집착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현실 내용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경우 각 현실 내용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본 바탕 실재의 정체를 함께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본 바탕 실재와 현실을 대조해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실재는 주체와의 관계를 떠난 가운데, 본래 있다고 할 본바탕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각 주체는 그가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실재는 각 주체가 그 내용을 끝내 얻을 수 없다. [불가득]
그래서 일체 분별을 모두 떠나게 된다.
그래서 2분법상 있음ㆍ없음ㆍ 같음ㆍ다름 등의 온갖 분별을 행할 수 없다. [불이법]
그리고 언설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의미를 갖지 않는 공이란 표현을 빌려 이를 표현하게 된다. [공]
그래서 본바탕인 실재는 결국 각 주체가 끝내 얻지 못한다.
그런데 생사현실은 이런 바탕에서 각 주체가 생생하게 얻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이는 꿈을 실답지 않다고 하는 사정과 마찬가지다.
꿈을 생생하게 꾼다.
그러나 꿈은 실답지 않다고 한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꿈은 꿈을 꾸는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화합해 얻어내는 것뿐이다.[임시성, 조건의존성]
그리고 꿈은 이에 기대하는 성품을 갖지 못한다. [가짜성품]
한편, 꿈 자체는 그 순간 생생하게 얻는다.
또한 침대가 놓인 현실도 그러그러하게 있다.
그러나 그런 꿈내용은 침대에서는 얻을 수 없다.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이런 사정들로 꿈은 실답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이 이와 마찬가지다.
현실 내용도 모두 일정조건에 화합해 얻는 내용이다.
한편 현실 내용은 각 영역에서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는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본 바탕을 비롯해 다른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한 내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유무판단]
우선 하나의 <감각현실>은 다른 종류의 <감각현실> 영역에서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본 색은 귀로 듣는 소리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또한 <감각현실>은 분별 영역에서도 없다.
또한 <감각현실>은 본바탕 실재 영역에서도 얻을 수 없다.
즉, <감각현실>은 본바탕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한편 <감각현실>은 참된 진짜라고 할 내용[실체]가 아니다.
한편, 관념분별도 사정이 같다.
관념분별은 다른 <감각현실> 영역들에서 얻을 수 없다.
또한 관념분별은 본바탕 실재 영역에서도 얻을 수 없다.
관념분별은 본바탕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한편 관념분별은 참된 진짜라고 할 내용[실체]가 아니다.
한편 현실내용에는 참된 진짜라고 할 실체가 없다.
본바탕 실재에도 역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ㆍ무자성이며 공하다.
현실 내용은 그런 가운데 그처럼 마음에서 화합해 얻는 것이다.
즉, 본바탕에서 얻을 수 없는 내용을 그처럼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화학식과 사정이 같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나타난다고 하자.
그런데 이 경우 수소나 산소에 물의 성품과 모습을 얻을 수 없다.
수소나 산소와 물을 놓고 대조해 살핀다.
이들은 서로 대단히 엉뚱하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물이 나타난다.
현실내용도 이와 사정이 같다.
현실 일체는 그 모두가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즉, 각 주체의 '마음에서' 화합해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현실 내용은 본바탕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정으로 생사현실은 마치 꿈과 성격이 같다.
현실에서 자신과 외부세상으로 보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들 일체가 모두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실답지 않다.
즉 현실은 집착을 가질만한 실다운 것이 아니다 .
따라서 현실에서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평소 일으킨 망상분별을 시정한다.
그런 가운데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업을 잘 끊고 중지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수행에 정진한다.
그래서 쌓여진 업의 장애를 잘 제거한다.
그리고 복덕 자량을 쌓는다.
이를 통해 일단 생사고통에서 벗어난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에 대한 잘못된 분별과 집착의 제거[아집(我執) 번뇌장(煩惱障)의 제거]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망집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이 경우 먼저 자신에 대해 갖는 망집을 잘 제거한다.
이후 일반 세상에 대해 갖는 망집도 함께 제거한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서로 관련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 밖의 외부 세계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따라서 이런 망집을 모두 제거한다.
각 주체가 얻는 현실 내용이 있다.
<감각현실>이나 느낌 관념 분별 등이다. (마음 내용)
이 일체는 모두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그 주체의 '마음'이 얻어낸 내용이다.
즉 이들 현실 내용은 모두 마음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존재를 시설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을 시설하고 살피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그래서 먼저 다음 사실부터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들 현실 내용은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눈을 감으면 이는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자신이 눈을 떠 얻어낸 내용이다.
이와 같이 현실내용 일체는 그가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사실을 먼저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에서 행하는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한다.
평소 자신이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들 내용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잘못이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그 내용을 얻어낸 자신>이 거꾸로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
이를 비유로 이해해보자.
어떤 그릇(~정신)에 물건이 담긴다.
이 경우 그 물건들은 그 그릇에 담긴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릇에 담긴 물건들> 가운데 하나를 취한다.
그리고 <그 물건>이 <'그런 물건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거꾸로 잘못된 이해다.
어떤 것이 무언가를 얻어낸다.
그래서 그것이 '얻어낸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거꾸로 <'그것을 얻어내는 주체'>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다.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그 부분의 본 정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일단, 그런 부분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얻어내는 진정한 자신>이 아니다.
좀 더 자세히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내용의 일부>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자신과 관련은 된다.
다만 이는 단지 자신이 걸친 옷과 같다.
이처럼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갖는 망집>을 잘 제거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행하는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수행을 정진한다.
♥Table of Contents
▣- 일반 현실에 대한 잘못된 분별과 집착[법집(法執), 소지장(所知障)]
소지장은 지적 번뇌다.
번뇌장안에도 일정한 지적 번뇌는 포함된다. (예: 5견)
그런데 이것을 별개로 구분하는 것은 다음 사정이다.
대승 보살 수행자는 성문승 수행자과 수행 목표점과 방안이 차이가 난다.
즉 중생제도를 위해 3계 생사현실 안에 들어와 임해야 한다.
그래서 3계의 생사묶임에서 벗어남을 목표로 하는 성문승과 입장이 다르다.
생사묶임에서 벗어남만을 목표로 할 때는 이를 장애하는 번뇌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나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을 제도하려면 다시
먼저 생사현실에서 겪는 생사고통을 평안히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의 본 바탕이 공함을 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현실을 마치 니르바나 상태처럼 여여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 [ 생사 즉 열반관 ]
그리고 또한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많은 방편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데 필요한 법신을 증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처럼 부처를 이루는 데 필요한 깨달음을 보리라고 칭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안에서 이런 보리를 증득함에 장애를 이루는 내용을 소지장으로 별도로 구분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자신과 근본정신에 대한 심층적 이해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를 먼저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다시 다음과 같은 추가적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렇게 얻는 내용은 각 주체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작 이들 내용의 성격에 대해 잘못 이해한다.
우선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사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 경우 그런 각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그 부분의 본 정체가 무언가를 파악한다.
그 부분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 부분은 모두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따라서 이렇게 올바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처음 분별이 잘못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신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 경우 다음 추가 문제를 함께 잘 이해한다.
우선, 일정 부분을 처음 a라고 여겼다고 하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a가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 그 a는 이제 다시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한편 그런 부분이 a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그렇게 a로 잘못 여긴다.
따라서 그렇게 되는 배경사정까지 잘 이해해야 한다.
자신에 관한 잘못된 분별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다음을 살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자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으로 여길만한 부분은 대신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신견을 일으키는 과정과 관련된다.
현실 표면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취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일정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기호로 )))로 표시한다고 하자.
이 경우 근본정신과 제7식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처음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구생기 신견]
그리고 이후 이에 바탕해 각 기관을 분화 발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3능변]
그리고 이런 ))) 바탕에서 현실에 태어난다.
그리고 생활해간다.
그런 가운데 다시 현실 의식 표면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 내용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분별기 신견]
그리고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는 생사과정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얻어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자신으로 여긴다고 하자.
현실에서 그런 부분이 갖는다고 여기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늘 그 부분이 파악되는 듯하다. [상일]
또 자신의 뜻에 따라 변화하고 움직이는 듯하다. [주재]
또 대상을 대하는 자신의 주관이 위치한 부분인 듯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그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현실에서는 그 부분이 이런 특성을 갖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사정으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런 특성으로 자신의 관념을 갖는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특성은 사실은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에 바탕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생사윤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보특가라]
그래서 차라리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실질적인 자신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한편 이제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실질적인 자신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에 다시 집착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데 이 역시 참된 진짜로서의 자신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잘 파악한다.
그런 가운데 이에 대한 잘못된 분별과 집착을 잘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다음 사정을 다시 이해한다.
현실에서는 각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기고 대한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대부분 이처럼 잘못 여기고 임한다.
따라서 잘못임에도 현실에서 대부분 그처럼 임하게 되는 배경사정을 파악한다.
즉 어떤 구조와 기제에서 그처럼 현실에서 임하게 되는가를 파악한다.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임한다고 하자.
이 때 표면의식에서 얻는 내용들 사이에 일정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근본정신의 구조와 이들 내용의 상호관계를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외부 세상에 대한 잘못된 분별제거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 경우 이런 분별에 바탕해 나머지 부분을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들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들 나머지 부분을 자신이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으로 잘못 여긴다.
또 이들이 모두 마음과는 떨어져 있는 별개의 외부 물질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자신과 자신의 것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먼저 자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시정해야 한다.[신견]
그리고 이에 바탕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시정해야 한다.
즉, 외부세상에 대한 잘못된 분별들도 제거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잘못된 분별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우선, 이들 현실 내용 일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들 현실 내용은 자신 내부에 들어온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 현실 내용이 자신 바깥에 있는 외부 내용일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들 현실 내용은 자신 밖에 있다고 할 외부 세상이 아니다.
한편 현실 내용은 한 주체가 그 입장에서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는 한 주체가 얻는 주관적 내용이다.
그래서 이는 그 주체를 떠나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이런 내용을 영희 철수가 다 함께 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한편 이들 현실 내용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안에 '그 내용을 얻게 한' 자신의 감관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즉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자신의 주관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현실 내용은 오히려 그런 감관을 통해 얻어낸 내용물이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그 내용을 얻게 한' 외부 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따라서 현실 내용은 자신이 상대한 외부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대상을 대해 얻어낸 내용물이다.
그래서 이들 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을 얻게 한 외부 대상은 없다.
한편 현실 내용 일체는 모두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주체의 마음이 얻어낸 내용이다. (마음 내용) [유식무경]
마음의 문제는 별도로 이후에 다시 살핀다.
그러나 여하튼 이들은 마음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과 구분되는 외부 물질이라고 할 바가 아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평소 행하는 판단은 거꾸로 뒤집힌 전도망상분별이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기본적으로 올바로 잘 파악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잘못된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올바로 찾기
일반적으로 처음 자신이 얻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외부 세상이라고 잘못 여겼다.
또 일부를 외부대상이라고 잘못 여겼다.
또 이들을 외부 물질로 잘못 여겼다.
그리고 이들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겼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잘못이다.
그런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의 본 정체는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현실 내용의 각 부분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그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 내용이다.
이는 마음과 관련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단, 평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가 잘못임을 이해한다.
그런 경우 이제 반대로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즉, 그렇게 일정한 부분에 대해 잘못 여겼다.
이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한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에 대해 잘못 여긴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에 해당할 부분을 대신 무엇인가를 적절히 찾아야 한다.
즉, 평소 일정 부분을 외부세상ㆍ외부의 객관적 실재ㆍ감관ㆍ외부대상ㆍ외부물질로 잘못 이해했다.
그런데 그런 각 부분이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세상ㆍ외부의 객관적 실재ㆍ감관ㆍ외부대상ㆍ외부물질에 해당한 내용은 무언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 이들은 결국 자신이 얻어낸 내용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얻는 내용 밖'에 그런 내용을 대신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데 현실 내용 일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 내용 밖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는가를 처음 문제 삼는다.
특히 외부 객관적 실재는 자신과 관계없이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본바탕 실재가 무언가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앞의 문제들은 결국 실재의 주체ㆍ실재의 감관ㆍ실재대상ㆍ실재의 본질을 판단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어떤 것인가를 살피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 실재에 대한 논의는 입장이 다양하다.
우선 그런 실재는, 자신이 얻는 현실내용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자신이 얻는 현실내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그와 비례하거나 유사하다는 입장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자신이 얻는 현실 내용 외에 일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 입장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유무의 양변에 치우친 잘못된 입장이다.
현실 내용은 자신이 관계해 얻어낸다.
그런데 본바탕 실재는 자신과 관계없이 그대로 있다고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실재가 무언가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 주체는 자신이 관계해 얻어내는 내용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주체로서는 문제 삼는 본바탕 실재 내용을 끝내 얻어낼 수 없다.
즉 자신이 관계하지 않는 내용을 각 주체는 끝내 직접 얻을 수 없다. [불가득]
그러나 이는 본바탕 실재가 전혀 아무 것도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즉, 어떤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한편 얻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을 있다고 단정해 제시할 도리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서 문제 삼는 2분법적인 분별을 모두 떠난다. [불이법]
즉, 무엇이 있다ㆍ없다ㆍ-이다ㆍ아니다ㆍ~과 같다ㆍ~과 다르다ㆍ깨끗하다ㆍ더럽다 등의 2분법상의 분별을 일체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실재는 언설로도 표현할 수 없다. [언어도단]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하게 된다. [불가득 공]
여기서 공은 그 자체로 별 의미를 갖지 않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공이라는 표현을 빌려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현실을 이런 본바탕 실재와 관련해 살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그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 내용은 한 주체가 현실에서 생생하게 얻는다.
그리고 명료하게 분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본바탕 실재는 그 내용을 한 주체가 얻지 못한다.
그래서 공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측면의 내용을 대조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현실 내용 일반에 대해 갖는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즉 법집을 제거할 수 있다. [법집의 제거]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 일체에 대한 부정과 긍정 - <생사 즉 열반>의 이론적 이해
생사현실 내 생사고통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 생사고통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다 제거하고 벗어난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표현한다.
현실 내용은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본바탕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한편, 생사현실을 본바탕 실재와 비교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은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런데도 잘못된 망집을 일으켜 생사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실답지 않은 생사현실을 남김없이 없앤다.
그런 경우 본바탕 실재만 남겨진다. [택멸 ]
그런 경우 본바탕에 본래 생사고통 자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바탕 실재는 곧 니르바나다.
그러면 생사현실 내 생사고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사고통 문제에서 이런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경우 생사 현실 일체를 다 부정한다.
그리고 이런 생사현실 일체를 제거해 없애는 경향을 갖는다.
그런데 이는 종기가 문제되어 몸 자체까지 다 제거하는 상태와 같다.
그 사정이 있다.
생사현실에서 고통이 문제된다.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려 한다.
그래서 고통의 본 정체를 이해한다.
그리고 고통의 발생과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 생사현실의 정체를 이해한다.
그 경우 다음과 같이 파악하게 된다.
본래 청정한 니르바나였다.
그런데 망집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소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생사현실 일체가 고통에 귀결된다.
따라서 이 망집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면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가 사라진 상태가 된다.
반면, 청정한 본래의 니르바나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을 기준으로 이를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상태를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다.
즉 종기를 제거하기 위해 몸 자체까지 다 제거한 상태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를 모두 제거하여 본래의 니르바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망집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으로 현실을 관한다.
그런 경우 본바탕 실재는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래 니르바나다.
그런데 생사현실은 이런 본바탕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니르바나인 실재 진여와 맞닿아 즉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취해 생사현실을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이 곧 니르바나(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본바탕과 대조해 대한다.
그러면 현실은 마치 꿈과 성격이 같음을 이해하게 된다.
즉 현실은 침대에서 누어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본래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생사현실 안에서 깨닫는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 안에서도 니르바나의 상태처럼 여여하게 임할 수 있다.
즉 생사현실 안에서도 생사고통을 떠나 임하게 된다.
이는 마치 꿈 안에서 그것이 꿈임을 이해하는 것과 성격이 같다.
이를 꿈에 비교해 살펴보자.
꿈을 꿀 때 반복해서 악몽에 시달린다.
그러나 꿈을 깨면 그것이 꿈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꿈을 꿀 때는 다시 그것을 모른다.
그리고 다시 악몽에 번번이 시달린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을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하게 되기 쉽다.
즉, 꿈을 깨고 다시는 꿈을 꾸지 않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가운데 그것이 꿈임을 알며 꿈을 꾼다고 하자.
그러면 꿈을 꾸어도 관계가 없다.
그런 경우는 굳이 꿈을 꾸지 않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꿈 안에서 얻는 다른 좋음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생사현실 사정도 이와 같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그러한 본바탕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의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굳이 생사현실을 실답지 않다고 제거할 필요가 없다 .
그리고 생사현실 내 무량한 선법도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생사현실 내 생사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도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할 수 있게 된다. [<생사 즉 열반>]
###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내 안인성취와 <생사 즉 열반>의 실증
생사현실은 <꿈>과 성격이 같다.
그런데 <생사현실>에서 안락함을 누린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서는 <생사현실>이 <꿈>과 성격이 같음을 이해할 필요성도 거의 없다.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것은 <극심한 생사고통>에 직면할 상황이다.
생사현실 안에서 <극심한 생사고통>을 당면한다.
그런데 <생사현실 안에서> 현실이 <꿈과 같음>을 잘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본바탕>이 <공>하다
<공한 실재>에서는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생사현실>은 이런 <실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사현실> 즉 <니르바나> 다.
곧, <생사 즉 열반> 이다.
수행자가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고 현실에 임한다
<생사현실>은 알고 보면 <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현실의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사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 임하는 한 일정한 <감각>과 <정서>와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만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생사고통>에 처해 평안히 임하는 수행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안인수행>이 성취된다고 하자.
그 경우는 그 수행자가 직접 이런 내용을 실제로 <증득한 상태>다.
즉, <본래 생멸을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가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증득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불퇴전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대단히 수준 높은 수행자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수행자가 <생사 즉 열반>을 현실에서 증득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생사현실의 극한 고통>도 <안인 수행>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상태가 <수행>에서 갖는 의미가 깊다.
특히 사바세계 즉 <인토>에서는 <이런 수행을 잘 성취하는 것>이 당면 수행목표가 된다.
[무생법인ㆍ안인의 성취ㆍ불퇴전위의 증득]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하자.
그러면 <이론>으로만 <생사 즉 열반>이 이해된 것뿐이다.
그런 경우 <현실>을 거꾸로 <생사고통>으로 대하게 된다.
[<생사 즉 열반> => <열반 즉 생사>]
다만 이들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즉 <무상ㆍ고ㆍ공ㆍ비아>와 <수행목표 상태>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를 살피는 가운데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 <생사 즉 열반관>과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
여하튼 본래 <현실>이 <니르바나>다.
그래서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의 '깨달음'>이 갖는 의미가 크다.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생사현실에서 <깨달음>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 안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생사현실 안에서> 차이가 크다.
♥Table of Contents
▣- 잘못된 <악취 공견>의 제거
생사현실의 <본바탕>은 차별 없이 공하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꿈>과 성격이 같다.
즉 침대에서 주는 바다꿈과 성격이 같다.
<생사현실 내용>은 <공한 본바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며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을 실답게 여기며 일으키는 <망집>을 제거할 수 있다.
또 망집에 바탕해 행하는 <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업을 행해 그 결과로 겪게 되는 <생사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당면하는 <생사 고통>도 완화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공함>만을 치우쳐 강조하게 되기도 쉽다.
현실의 <본바탕>이 공함만을 치우쳐 감소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이 <실답지 않음>만을 치우쳐 강조하게 되기 쉽다.
그런 경우 이런 사정 때문에 다음처럼 잘못 여길 수 있다.
즉 생사현실 일체의 본바탕은 본래 <차별 없이> 공하다.
그래서 생산실 일체는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실답지 않다
따라서 다음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즉 <생사현실의 생사고통>은 실답시 않기에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하다 .
또는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막행막식>해도 무방하다.
또는 이전처럼 <망집>에 바탕해 그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또는 오히려 더 심하게 <악>을 행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기 쉽다.
이처럼 공에 바탕해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 내 <무량한 온갖 선법>까지 다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무량한 선법>까지 함께 제거하려 하기 쉽다. [악취공견]
이를 통틀어 <악취공견>이라 할 수 있다.
<생사현실>은 <꿈>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생사현실>은 정작 <꿈>은 아니다.
<생사현실>이 완전히 <꿈>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단지 <꿈만 깸>으로써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꿈의 경우에서는 꿈을 깨면 현실에 놓인 침대나 현실 내용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 내용과 꿈을 곧바로 대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꿈이 실답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사현실은 이와 다르다.
생사현실에서는 생사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바탕 실재를 곧바로 확인할 수는 없다.
본바탕 실제는 생사 과정을 반복해도 그 내용을 직접 얻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본바탕 실재와 현실을 직접 비교 대조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생사과정을 반복해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곧바로 알기는 곤란하다.
한편 생사현실은 꿈과 달리 이를 실답게 여기게 할 특성을 많이 갖는다.
즉 <생사현실>은 <꿈>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생사현실은 , <다수 주체>가 -<일정한 시기> -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 일정한 결과>를 엇비슷하게 반복해 받아나간다.
또 생사현실은 각 부분이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자신>과 <다른 사람>, <그 외 다른생명> 그리고 <무생물 부분> 등이 특성이 달리 파악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 각 내용은 대단히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게 된다.
<생사현실>은 <꿈>과 달리 대단히 실답게 여겨진다.
이런 사정으로 생사현실은 <실답게 여겨지는 정도>가 강하다.
이런 점이 <꿈>과 다르다.
이런 사정으로 <생사현실>을 실답게 여기는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것을 대단히 <실답게> 여기며 받아가게 된다.
따라서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그 하나하나는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러나 <실답다>고 여기고 대한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이를 <실답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이에 비례해 <이를 극복할 수행방안>이 필요하다.
수행자가 <공함>을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이 <꿈과 같이 실답지 않음>을 잘 이해한다.
그렇다해도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수행과정에서의 이런 <작은 어려움>도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원래의 <망집 상태>로 물러나 머물기 쉽다.
그리고 평소 행하듯, 마음대로 행하려 하기 쉽다.
더 나아가 <공>에 대해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악취 공견>을 갖고 임하기 쉽다.
즉 현실은 <차별 없이> 공하다.
사정이 그렇기에 현실에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전 <망집상태>보다 훨씬 더 심하게 <업>을 행하게 된다.
또 그로 인해 훨씬 신속하게 <생사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가 수행과정의 <작은 어려움>도 잘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래서 <업>을 행해 <심한 고통>에 처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그런 심한 고통>을 극복하기 힘들다.
<생사현실>이 모두 <차별 없이> 공하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고통>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생사현실 안에서 <업의 장애>를 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공연히 악업을 행해 <고통>에 처할 필요도 없다.
이는 자신이 생사 고통을 벗어나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일체가 <공>하다.
<현실>이 <꿈>과 같다.
그렇다고 생사현실의 <온갖 선법(善法)>까지 다 함께 없앨 필요는 없다.
이는 <중생 제도>의 측면에서도 도움 되지 못한다.
이들 <악취공견 >문제는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생사 즉 열반>의 입장으로 생사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수행>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악취공견>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참고 ▣- 집착이 없으면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악취공견)]
수행자는 <실상>을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자는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즉 <실상>과 <생사현실>의 2 측면과 그 관계를 모두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지는 이 <양 측면>에서 모두 올바르고 바람직한 형태로 잘 임해야 한다.
즉 <실상>과 <생사현실>의 측면을 통해 모두 올바른 수행자세로 임해야 한다.
즉, 일체의 실상은 차별 없이 <공>함을 관한다.
그런 가운데 <고통과 번뇌>는 모두 제거하고 극복한다.
그리고 <수행과정의 어려움>도 이를 통해 잘 극복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겪을 생사 고통을 미리 예방한다.
한편 아직 남은 <업장>으로 <생사고통>을 겪게 될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실상이 차별 없이 공함을 관해 이를 잘 극복한다.
한편 <생사현실의 측면>에서는 다시 <무량한 선법>을 닦아 나간다.
즉, 수행을 통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잘 구족한다.
그리고 상사현실 안에서 <중생>을 잘 제도해 나간다.
즉 중생들을 <생사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처럼 <2중적인 측면>을 모두 각각 잘 이해한다.
그래서 각 측면에서 모두 <좋고 바람직한 형태>로 임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무량행문을 통한 무량 방편지혜 구족과 중생제도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중생 스스로는 <생사현실>을 벗어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수행자가 <생사현실>에 같이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생사현실 안에서> 수행자 자신부터 <계>를 잘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부터 <복덕자량>을 구족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계를 해결하기 힘든 빈곤> <질병> <노예와 같은 낮은 지위, 신분> <죄인으로 감옥안에 갇혀 묶여 지냄> 등과 같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행자는 자신부터 생사현실에서 먼저 <계>를 잘 성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행자자신부터 <업의 장애>를 잘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복덕자량>부터 잘 구족해야 한다.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지혜자량>을 잘 구족해갈 수 있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잘 <제도>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망집>을 제거한 바탕에서 <무량한 선법>을 잘 성취해가야 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할 구체적인 <방편지혜>를 닦아 나간다.
이 경우 중생제도를 위해 <선교방편>을 원칙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선교방편>만으로 제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생제도를 회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중생을 끝내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중생제도를 위해 제한 없이 <온갖 방편>을 다 사용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부터 이로 인해 <업의 장애>를 쌓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지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
또 이를 방치하면 이로 인해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일도 장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수행자는 이를 극복하고 중생을 제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신부터 <생사현실의 어떤 극한 상황>도 평안히 참고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소 <안인>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무생법인>을 증득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문수보살과 같은 <서원>을 가져야 한다.
즉, 자신이 설령 지옥에 임하게 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를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생을 끝내 제도하겠다.
이런 <서원>과 <수행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중생의 <무량한 번뇌>에 대응해 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무량한 방편지혜>를 닦아 나간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한다.
그리고 끝내 <성불>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보살수행과 바라밀다
수행자가 <중생제도>와 <성불>을 목표로 수행한다고 하자.
중생은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되풀이 받아 나간다.
여기서 제도(濟度)는 이런 중생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 니르바나(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서원>을 갖고 수행하는 이를 보살(菩薩)이라고 칭한다.
이는 보리살타(菩提薩埵 bodhisattva)의 줄임말이다.
이는 본래 <정각>을 얻기 이전 전생의 석존을 의미한다.
전생에 석존은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고 노력하였다.
이후 중생을 제도(濟度)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고 노력하는 이들을 널리 의미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리(菩提 bodhi)는 최상의 지혜의 깨달음[각(覺)]을 뜻한다.
살타(薩埵 sattva)는 생명[=유정有情=중생衆生]을 뜻한다.
결국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 다른 생명들을 생사고통에서 구하는 이를 나타낸다.
즉, <깨달음>을 구하며 <자기>도 이롭고 <다른 생명>도 제도해 이롭게 하는 수행자를 나타낸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하기 위해 제각각 서원을 갖고 실천해간다.
보살들이 갖는 서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번뇌>를 다 끊는다.
<법문>을 다 배운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다른 생명들을 <제도>(濟度)한다.
그래서 다른 중생들도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되도록 이끌어 나간다.
즉, 다른 생명들도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부처를 이루고 다른 생명을 제도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중생을 제도(濟度)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생사고통을 겪는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중생과 입장을 같이 해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보살은 <중생제도>와 <성불>의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의 <바라밀다> 수행을 한다.
♥Table of Contents
▣-보시(布施, dāna-pāramitā)
중생에게 좋음(+)을 아끼지 않고 베품을 말한다.
이에는 크게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가 있다.
♥Table of Contents
▣-정계(淨戒, 지계持戒, śīla-pāramitā)
중생에게 나쁨(-)을 가하지 않는다.
계를 원만히 성취한다.
특히 중생이 집착하는 것(생명 신체, 재산 가족 등)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다.
♥Table of Contents
▣-안인(安忍, 인욕忍辱, kṣānti-pāramitā)
나쁨(-)을 받을 때 이를 평안히 참고 나쁨(-)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
자신이 다른 생명으로부터 침해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억울한 고통을 평안히 잘 참는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Table of Contents
▣-정진(精進, virya-pāramitā)
정진은 모든 수행 부분에서 수행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감을 뜻한다.
그러나 수행자가 중생제도를 위해 정진으로 성취할 수행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4 정단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없는 악은 키우지 않는다.
있는 악은 키우지 않는다.
없는 선은 만들어 낸다.
있는 선을 키워나간다.
이 사정은 『잡아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정진근이란 4정단(正斷)임을 알아야 한다.
{ K0650v18p0959a15L; 잡아함경『雜阿含經』 제26권 646. 당지경(當知經) }
♥Table of Contents
▣-정려(靜慮, 선정禪定, dhyāna-pāramitā)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
♥Table of Contents
▣-반야(般若, prajñā-pāramitā)
모든 현실 내용에 대해 그 본바탕 실상을 꿰뚫어 그 정체를 잘 관한다.
♥Table of Contents
▣-방편(方便, upāya-pāramitā)
방편바라밀다는 보시, 정계, 안인을 돕는다.
중생을 제도하는 가지가지 방편을 의미한다.
♥Table of Contents
▣-원(願, praṇidhāna-pāramitā)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하고자 하는 서원을 일으킨다.
원바라밀다는 정진바라밀다를 돕는다.
♥Table of Contents
▣-력(力, bala-pāramitā)
실천수행하고 진리를 판단하는 힘을 갖는다.
력바라밀다는 정려바라밀다를 돕는다.
♥Table of Contents
▣-지(智, jñāna-pāramitā)
일체법을 분별해 아는 지혜를 의미한다.
지바라밀다나 반야바라밀다나 모두 지혜와 관련된다.
그런데 반야바라밀다는 법계의 무분별 지혜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지바라밀다는 세간의 분별 지혜에 해당한다.
즉, 승의(勝義)를 취하여 분별함이 없이 굴리는 청정하고 미묘한 지혜[慧]는 혜(慧)바라밀다이다.
반면 세속을 취하여 분별함이 있게 굴리는 청정하고 미묘한 지혜[智]는 지(智)바라밀다이다.
{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49권 ④셋째 지구경유가처(持究竟瑜伽處)의 행품(行品) K0570 v15, p.882b }
지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를 돕는 관계에 있다.
계ㆍ정ㆍ혜 3학과 바라밀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시ㆍ정계ㆍ안인 3가지는 가장 높은 계학에 포섭된다.
정려는 가장 높은 심학에 포섭된다.
반야는 가장 높은 혜학에 포섭된다.
정진은 계학 심학 혜학 일체에 두루 적용된다.
복덕과 지혜 자량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시ㆍ정계ㆍ안인 3가지는 복덕의 자량에 포섭된다.
반야는 지혜의 자량에 포섭된다.
정진과 정려 두 가지는 복덕과 지혜자량 모두에 포섭된다.
보시ㆍ정계ㆍ안인 3가지는 생명을 넉넉하고 이롭게 한다.
정진ㆍ정려ㆍ반야 3가지는 일체 번뇌를 물리친다.
6바라밀다의 수행 차례는 다음과 같다.
몸과 재물에 대하여 돌아보거나 인색함이 없다.
그러면 곧 청정한 금계(禁戒)를 받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금계를 보호하기 위해 곧 인욕(忍辱)을 닦는다.
인욕을 닦고는 능히 정진을 낸다.
정진을 일으키고는 능히 정려를 성취한다.
정려를 갖추고는 곧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해심밀경』 제4권 7. 지바라밀다품地波羅蜜多品 K0154 V10 P.734c }
◧◧◧ para-end-return ◧◧◧
*pt* 시작 to k0020sf--♠○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오온에 대하여
[반복]
>>>
♥Table of Contents
▣●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의 의미
우선, 경전에서
"색(色)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라고 제시된다.
그런데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란 일반적으로 <낯선 표현>이다.
그래서 우선 이들 <표현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반복끝]
♥Table of Contents
▣- 일체를 분류하는 여러 방식과 5온
부처님 가르침에 <일체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어 5온ㆍ6대ㆍ12처ㆍ18계 등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5온은 그런 <분류 범주>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각각 일체>를 이 안에 포함해 넣는 <분류 범주>가 된다.
즉 <세계>와 <자신>의 모든 내용이 다 이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날 세계를 크게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이런 분류방법>과 차이가 있다.
<부처님이 대한 세계>가 <일반인들이 대하는 세계>와 서로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정체를 올바로 볼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분류 방식>과 <의미>에 차이가 있게 된다.
즉 각 내용이 갖는 그 <의미>, <성격>과 <지위>에 입장이 서로 다르다.
♥Table of Contents
▣-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총괄적 의미
먼저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이는 간단하지 않다.
각 단어는 각기 <다른 분류>에서도 사용된다.
그리고 각 경우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 경우 달라지는 <구체적 의미>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가장 단순하게 살펴보자.
5온은 <세계>와 <자신> 일체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신이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5온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된다.
이렇게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넓은 의미의 색>과 <좁은 의미의 색>
어떤 이가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다가 <눈을 뜬다>고 하자.
이 순간 그가 <감각해 얻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 그가 얻는 <그 일체>는 우선 '<좁은' 의미의 색>[색깔]에 속하게 된다.
한편, 어떤 이가 <귀>를 막고 있다.
그러다가 <귀>를 열어 얻는 내용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그가 얻는 것>은 모두 성[소리]에 속하게 된다.
각 <감각현실>이 마찬가지다.
즉, <눈>으로 감각해 얻는 내용을 색[색깔]이다.
또 <귀>를 통해 감각해 얻는 내용은 성[소리]이다.
또 <코>를 통해 감각해 얻는 내용은 향[냄새]이다.
또 <혀>를 통해 감각해 얻는 내용은 미[맛]이다.
또 <몸>을 통해 감각해 얻는 내용은 촉[촉감]이다.
그런데 <5온에서의 '색'>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색>'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5온에서의 '색'>은 앞의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을 모두 포함해 나타낸다.
결국 <5온에서의 '색'>은 <감각과정을 통해 얻어낸 내용> 일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먼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수의 의미
한편, 어떤 이가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그런 감각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일정한 느낌>을 일으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등을 느낄 수 있다.
또는 예를 들어 <아늑한 느낌>, <편안한 느낌>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그런 느낌>을 '수'라고 표현한다.
또는 <그런 느낌을 얻는 작용>을 '수'라고 표현한다.
♥Table of Contents
▣- 상의 의미
한편 어떤 이는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관념>을 일으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을 감아 , <무언가>를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마음으로 <일정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들 내용은 <감각내용>이 아니다.
이는 <관념적 내용>이다.
그리고 이처럼 관념을 처음 일으켜 얻는 <작용> 및 <그 관념>을 상(想)이라고 표현한다.
이들 <관념>은 물론 감각내용과 함께 <동시>에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각과 <관계없이>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 마음에서 떠올려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특성 차이를 통해 <관념>과 <감각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떠 <일정한 모습>을 본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눈을 감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그런 내용>은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감각내용>이다.
이들 <감각현실>은 그 관계를 떠나면 그 직후에도 유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눈을 감는다고 하자.
그런 상태에서 그 직전에 본 모습을 그대로 되살릴 수 없다.
이런 점이 <관념>과는 다르다.
♥Table of Contents
▣- 행의 의미
한편 어떤 이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 생각을 통해 <또 다른 생각>을 연상해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정한 <생각, 말, 행위, 태도>등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생각을 바탕으로 일으키게 되는 다음의 <변화, 반응>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행(行)이라고 표현한다.
♥Table of Contents
▣- 식의 의미
한편 우리가 어떤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단지 어떤 <관념>을 일으켜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문제되는 내용>을 <다른 것>과 서로 <대비>하여 구별해야 한다.
즉, 어떤 내용을 다시 <다른 내용>과 함께 <병존>시킨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대조해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인식> <분별> 및 <분별작용>을 현실에서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인식 분별내용> 및 <그 작용>은 식(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들 표현의 <대강의 의미>이다.
각 표현의 <자세한 의미>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하다.
♥Table of Contents
▣- <식>의 다양한 의미
<식>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식>이라는 표현은 여러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무명-행-<식>-명색-... 처럼 <12연기>과정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또 세계를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 5온>으로 분류할 때도 사용된다.
또 세계를 지ㆍ수ㆍ풍ㆍ화ㆍ공ㆍ<식>의 <6대>로 분류할 때도 사용된다.
또 안<식>ㆍ이<식>ㆍ비<식>ㆍ설<식>ㆍ신<식>ㆍ의<식> 으로 <12처>와, <18계>를 분류해 나열할 때도 사용된다.
한편, 심ㆍ의ㆍ<식>으로 마음을 나열해 말할 때도 사용된다.
이런 경우 심ㆍ의ㆍ<식>은 다음처럼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즉 심(citta)은 집기(集起-쌓고 일으킴)
의(manas)는 사량(思量-생각하고 헤아림)
<식>(vijñāna)는 료별(了別-분명히 인식하고 명료히 구별해 판단 분별함)
한편,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제1ㆍ2ㆍ3ㆍ4ㆍ5<식> 제6<식>ㆍ제7<식>ㆍ제8아뢰야<식>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각 경우에 모두 <식>이란 표현이 들어간다.
또 한편, 다시 제8식은 <심>, 제7식은 <의>, 제1~ 6식은 <식>으로 구분해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 입장이다.
우선 제8<식>은 일체종자를 모으고 현출시킨다.
따라서 심[集起]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7<식>은 대상을 헤아린다.
따라서 의[思量]라고 한다.
또 제1ㆍ2ㆍ3ㆍ4ㆍ5ㆍ6 <식>은 내용을 명료하게 식별한다.
따라서 <식>[了別]이라 하는 입장이다.
인식 분별내용을< 식>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리고 <감각현실>을 얻는 경우도 제1ㆍ2ㆍ3ㆍ4ㆍ5<식>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감각과정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제6 의<식>처럼 분별 음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식>ㆍ이<식>ㆍ비<식>ㆍ설<식>ㆍ신<식> 등의 5<식>에서의 <식>의 의미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해할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일정한 <감각현실> 색을 얻는다고 하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 <감각현실> 각 부분의 <의미를 분별함>을 <안식>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이<식>ㆍ비<식>ㆍ설<식>ㆍ신<식>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귀로 얻는 소리의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이 상태에서 다시 소리 각 부분의 의미를 분별함을 <이식>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눈으로 <감각현실>을 얻는 작용을 그대로 <안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머지 이<식>ㆍ비<식>ㆍ설<식>ㆍ신<식>도 마찬가지다.
한 주체가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데 이 <감각현실> 각 내용은 우선 다 <같은 형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뜨면 <무언가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흰 색>이거나 <검은 색>이 아니다.
각 부분의 <색>이 다르다.
나머지 감각들, 즉, <성ㆍ향ㆍ미ㆍ촉>도 마찬가지다.
감각과정에서 각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감각영역에 각 경우 각 부분 <다른 형태>로 구분된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넓게 보아 <감각과정>도 <각 부분>을 구분해 내용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감각과정>도 일종의 <분별>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ㆍ이식ㆍ비식ㆍ설식ㆍ신식]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을 제6의식 분별처럼 <분별 음미>하지는 않는 것뿐이다.
여하튼 <식>이라는 표현 자체는 각 경우마다 조금씩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된다.
그래서 일정 주제와 관련해 <식>이란 표현을 사용해 논의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표현 의미>에 대해 혼동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논의>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Table of Contents
▣- 마음작용에서 <기관>ㆍ<작용>ㆍ<결과내용>의 구분
5온에서 <수ㆍ상ㆍ행ㆍ식>은 <마음현상>과 관련된다.
<마음작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구분이 문제된다.
우선 정신작용을 행하는 <기관>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관이 행하는 기능으로서 <정신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 작용을 통해 <얻어내고 쌓여진 결과물>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심ㆍ의ㆍ식>을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런 경우 정신작용의 <기관>은 <의> 란 표현과 가깝다.
그리고 그 <작용>은 <식>이란 표현과 가깝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내용>은 <심>이란 표현과 가깝다.
그런 가운데 <'5온에서의 식'>은 이 가운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가도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수ㆍ상ㆍ행>의 표현에서도 이런 문제가 모두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에 관해서도 다음 여러 논의가 가능하다.
어떤 이가 어떤 상황에서 쾌적하고 아늑한 느낌을 느낀다.
이런 경우 우선 이런 느낌을 얻는 <기관>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얻는 정신 기능으로서 <정신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작용을 통해 <얻게 된 내용>으로서 느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수>란 표현이 이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나타내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를 널리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 작용 일체를 모두 포함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수>란 표현이 <일반감각작용>이나 <감각내용>도 함께 포함하는가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감각작용을 통해 <얻는 내용>은 이미 <색>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감각내용을 다시 <수>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감각내용>은 색이다.
그런데 <감각작용>만 떼어 내어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자.
이런 경우 <느낌>과 <느낌을 얻는 작용>도 그처럼 따로 나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는 <느낌>과 <느낌을 얻는 작용>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가 다시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단순히 <감각내용을 얻는 작용>은 '<촉>'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몸을 통해 얻는 촉각내용>을 나타내는 '<촉>'과는 또 다르다.
그런 경우 <감각을 얻는 작용>은 이런 분류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이들 5온 분류가 <실재 영역>도 포함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실재>는 얻을 수 없어 <불가득 공>으로 본다.
그런데 <얻지 못하는 내용>을 분류해 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5온 분류>는 실재에 대한 분류로 볼 것은 아니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다.
그리고 이들 의미는 언뜻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처럼 복잡하다.
그래서 간단히 살피기 힘들다.
다만, 여기서는 위와 같이 <기초적인 대강>만 살피고 마치기로 한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후 관련부분에서 살펴가기로 한다.
>>>
♥Table of Contents
▣●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 분류의 의미
불교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제시한다.
이는 <자신>과 <현실 세계>가 바로 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자.
이 경우 곧 <현실 일체>에 대해 모두 판단함이 된다.
이 경우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자신과 세계를 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분류하는가.
또 이것이 왜 <일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자신을 포함해 <세계 일체>에 대해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왜 이처럼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나누어 관찰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Table of Contents
▣- <현실 일체>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5온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의미를 대강 살폈다.
그런데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현실 일체>를 포함하는 <범주>로 사용된다.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를 <세계>와 <자신>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들 <현실 일체>는 이 <다섯 범주> 안에 포함되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현실에서 얻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본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 일체>는 결국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포함된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의 구성요소>로서 5온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스스로 <일정부분>을 자신이라고 여긴다.
이런 경우 결국 그런 내용은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포함된다.
그래서 결국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
물론 이는 옳은 판단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게 되는 내용>은 결국 5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그림>을 참조해보기로 하자.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Table of Contents
▣- 평소 눈을 떠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의 정체
1이라는 사람이 눈을 떠 무언가를 본다고 하자.
1자신이 <눈을 떠 얻게 되는 모습 전체>를 큰 사각형 (5!)에 대강 표시했다.
이 경우 평소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이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고 하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 그림에서 (1!)로 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눈이나 이마, 뒷머리, 허리 등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부분> 가운데 <일부>만을 보게 된다.
그래서 (1!) 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2!) 부분은 자신과 비슷하고 언어소통이 되는 <다른 사람> 철수를 나타낸다.
(3!) 부분은 <다른 생명체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다.
사람 가운데 멀리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외 강아지나 고양이 등도 이에 포함된다.
(4!) 부분은 산과 바위 등 <무정물> 즉, <생명 아닌 물체>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평소 이들 각 부분은 특성이 서로 다르다고 여기게 된다.
결국 이는 <자신이 눈을 떠 얻는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나열해 표시한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좁은 의미의 색
어떤 이가 <눈>을 뜬다고 하자.
이 경우 <얻는 내용>이 있다.
이를 불교에서 <색>이라 표현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색'>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뜬다.
이 경우 <하늘의 별>을 보게 된다고 하자.
또는 산에서 아래 넓은 <도시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런 경우 그 모두가 모두 <좁은 의미의 색>에 해당한다.
<눈을 떠 얻어내는 내용>은 모두 <좁은 의미의 색>이다.
위 그림으로 <좁은 의미의 색>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 살필 수 있다.
그리고 <12처>나 <18계> 분류에서의 <색>은 이런 의미다.
(안-'색(色)',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眼耳鼻舌身意
色聲香味觸法)
♥Table of Contents
▣- 넓은 의미의 색(<감각현실>) 가운데 일부
위 그림은 단지 <눈으로 얻는 내용>만 표시되고 있다.
즉, 위 그림은 <좁은 의미의 '색'>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5온> 분류에서의 <색>은 다른 감각내용 까지 함께 다 포함한다.
즉 소리(성聲)ㆍ냄새(향香)ㆍ맛(미味)ㆍ촉감(촉觸)을 다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주체는 <눈>으로 일정한 색을 얻는다.
또 <귀>로 <소리>를 얻는다.
또 <코>로 <냄새>를 맡는다.
또 <혀>로 <맛>을 느낀다.
그리고 몸으로 <촉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감각하여 얻는 현실내용> 일체를 '<넓은 의미의 색>'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위 그림은 <넓은 의미의 '색'>가운데 하나가 된다.
즉, 눈을 통해 얻어낸 <좁은 의미의 색>(色)이다.
그래서 위 그림은 <넓은 의미의 '색' > 가운데 <성ㆍ향ㆍ미ㆍ촉> 등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
또 5온 가운데 <수ㆍ상ㆍ행ㆍ식>도 표현되지 않고 있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이 얻어낸 내용 (마음 내용)
한편 그림 전체는 <1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더 자세히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이라고 하게 된다.
다만 이 내용이 <마음 내용>임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마음>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별도로 <있다>고 시설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는 여기서는 일단 생략한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여하튼 미리 결론을 제시한다면, 이들 내용은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Table of Contents
▣- <5온>과 <자기 자신>의 관계
평소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이를 그림으로 위와 같이 표시했다.
그 가운데 평소 <그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 임한다.
그런 부분이 위 그림에서 (1!)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눈으로 얻는 <감각현실>의 경우다.
그런데 다른 <감각현실>도 마찬가지다.
평소 이런 <감각현실 가운데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손으로 만져지는 <자신의 몸> 부분도 이와 사정이 같다.
그러나 한 주체는 단순히 <감각현실> 부분만 취해 <자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만일 <감각현실> 부분만 <자신>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반 물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느낌, 관념, 행위, 분별인식작용>을 다 함께 갖춰야 비로소 이를 생명체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각작용>을 행하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데 현실에는 단순히 자극을 감지해 반응하는 <센서>도 있다.
한편, <느낌이나 관념>을 얻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데 현실에는 연산 처리를 해 출력해내는 <컴퓨터>도 있다.
한편, 단순히 <행위 동작>을 하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데 현실에는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나 로봇도 있다.
그래서 생명체를 이들과 구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함께 나열하게 된다.
결국 이런 내용이 <단순한 물체>와 <생명체>를 구분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평소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것은 결국 <5온>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잘못된 판단이다.
즉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우선 <이들 5온>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들이다.
그런데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그 자신>'이 들어 있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평소 눈을 떠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이는 자신이 눈을 떠 <얻어낸 내용>이다.
또 다른 <수ㆍ상ㆍ행ㆍ식>도 사정이 같다.
이들 일체는 그 주체가 현실에서 <얻어낸 내용>이다.
이처럼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에 <그 주체>가 들어가 있다고 할 도리는 없다.
그래서 <이들 내용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한편, 평소 눈을 떠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이를 <자신>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자신이 눈을 감으면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이 사라졌다고 여기는 이는 없다.
결국 평소 눈을 떠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나머지 <감각현실>도 사정이 같다.
한편, 어떤 사고 등으로 <느낌ㆍ생각ㆍ행동ㆍ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이런 환자를 간호하는 입장>에서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여전히 <일정한 주체>가 계속 유지됨을 관찰한다.
또 그런 환자가 다시 <의식>을 깨어나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ㆍ상ㆍ행ㆍ식>도 자신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또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소 <자신으로 여기는 각 부분>은 자신이 걸치는 <옷>과 같다.
이처럼 <비유>적으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망집>에 바탕해 대부분 임한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낸 이들 <5온> 가운데 <일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자신으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정체는 결국 그 주체가 얻어낸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다.
결국 <망집>에 바탕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은 <5온>에 해당한다.
♥Table of Contents
▣- '색'이란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
현실에서 각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내용 자체>는 각 주체들간에 엇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얻어낸 내용의 <정체>나 <성격>에 대해 서로 달리 판단한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임하기 쉽다.
예를 들어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그것을 <다음 그림>처럼 표시해볼 수 있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평소 <바위로 여기는 부분> (4!) 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고 하자.
이는 <좁은 의미의 색>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다.
<'외부 세상'>의 한 부분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또 이를 '<객관적 실재>'라고도 잘못 여긴다.
또 눈이 대한 '<외부대상'>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동작시 자신의 손이 대하는 <'대상'>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또 이를 '<외부 물질'>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처럼 표현한다.
이 경우 이들 <표현이 가리킨 부분>은 같다.
그러나 이들 각 표현이 담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각기 그에 관한 <논의>가 달리 이뤄질 수 있다.
현실에서 각기 다른 <언어표현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아버지>라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영희가 <아저씨>라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같다.
그래도 각 표현의 <의미>는 다르다.
따라서 각 경우 표현이 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를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색'은 자신의 몸이 아니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한 주체는 이 가운데 일부 (1!)을 평소 <자신>으로 여긴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 부분 (1!)은 이는 <좁은 의미의 색>의 한 부분이다.
이들 내용은 <신견>을 살필 때 대강 살폈다.
(참고 ▣- 신견의 제거)
따라서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
그러나 <신견>의 제거는 수행에서 중요하다.
한편 <외부 세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제거함에도 중요하다.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러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외부세상>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 대한 <분별>이 잘못임을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신견>부터 잘못임을 살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현실에서 <자기 자신>으로 보는 내용의 검토
현실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얻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취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이는 <뒤바뀐 전도 망상 분별>이다.
일반적으로 <나>라고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이런 색(색의 일부분)을 기초 요소로 한다.
그리고 이런 색과 함께 <수ㆍ상ㆍ행ㆍ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나>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1!) 의 부분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되는 <배경 사정>을 살펴보자.
♥Table of Contents
▣- 상일성
현실에서 눈을 떠 (1!) 부분을 대한다.
평소 (1!) 부분은 <늘 대하는 내용>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1!) 부분은 늘 일정하게 머무르는 <주인>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매 상황마다 들고 나며 바뀐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1!) 외의 내용은 그 때 그 때 내용이 달라지는 <손님>과 같다고 여긴다.
이런 사정으로 (1!) 부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잘못 여기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주재성
한편 손발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또는 자신이 어디론가 움직여 가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정한 (1!) 부분만 <뜻>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여기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대상에 대한 주관
반면, (1!)부분을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댄다고 하자.
그런 경우 (1!)부분에서 <촉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바위에 몸을 댄다.
그러면 <몸>에서 <촉감>을 느낀다.
이 경우 바위 부분 쪽에서는 촉감을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돌을 (1!)부분에 던진다.
그러면 <촉감>을 느낀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돌을 던진다.
그러면 촉감을 느끼지 못한다.
한편 자신의 손을 들어 <자신의 신체부분>을 만진다고 하자.
그러면 손과 그 신체부분 <양쪽>에서 촉감을 느낀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부분> 을 만지는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손 부분> 한측면에서만 느낀다.
이처럼 각 부분의 사정이 달리 파악된다.
따라서 (1!) 부분을 자신의 <주관이 위치한 부분>으로 잘못 여긴다. [주관이 위치한 부분]
이런 사정으로 평소 이런 (1!) 부분을 자신의 <육체>로 여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신활동>이 행해진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육체[색]과 정신[수ㆍ상ㆍ행ㆍ식]이 결합된 것을 자신이라고 잘못 관념한다.
그래서 (1!) 부분에 대해 잘못된 <신견>을 갖는다. [분별기신견]
pc3 tb04 tb5 tb6 pc7 tb8 tb9
sss
♥Table of Contents
▣- 색의 일부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배경 - 구생기신견
현실에서는 (1!) 부분은 <다른 부분>과 어느 정도 <다른 특성>이 파악된다.
그런데 이는 그가 그렇게 <분별>을 해서 <그런 특성>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주체가 정신없이, 분주히 활동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매 순간 각 부분을 <자신의 몸>이라고 분별할 틈이 없이 분주히 임한다.
그런데 평소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위와 같은 특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어떤 모임>에 나갔다.
그래서 미처 자신의 몸 각 부분을 일일이 <분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자신의 목>이나 <손발>을 떼어 놓고 모임에 가게 되는 경우는 없다.
한편, 아예 <사고>나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해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이 상황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가 그를 간호하며 옆에서 지켜본다고 하자.
그런 <제 3 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1!)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른 <일정한 특성>을 갖는다고 파악된다.
결국 (1!) 부분을 <자신 몸>이라고 분별한다고 하자.
이는 이런 특성에 따른 <후발적인 분별>이다.
그런 결과 <각 부분>을 구분해 관념한다.
이 가운데 (1!)의 부분에 대해 → <'나'>라고 관념한다.
또 다른 (2!) 부분에 대해 → 자신과 의사소통이 되는 <다른 이> 철수라고 여긴다.
또 다른 (3!) 부분에 대해 → 사람과 비슷한, 강아지, 소, 등 <다른 생명체>로 여긴다. 멀리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4!) 부분에 대해 → <무생명체>로서 '바위' 로 관념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눈을 떠 함께 얻는 <감각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처럼 <각 부분>의 특성이 다름을 파악한다.
그런데 이런 특성은 그가 <현실에서 일으키는 분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 부분이 <이런 특성>을 갖는 데에는 배경사정이 있다.
이는 <생을 출발하는 이전 단계>에서 일으킨 <망집>이 그 배경 원인이 된다. [구생기신견]
<생을 출발하는 이전 단계>에서는 <일정한 정신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처음 <근본정신>과 관련해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망집>을 일으킨다.
[제7식의 아치, 아견,아만, 아애]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각 <주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태어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그 <주체>는 <감각현실>을 얻게 된다.
이 때 그가 눈을 통해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특성이 다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후발적>으로 다시 <잘못된 분별>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 <잘못된 망상분별>을 한다고 하자.
그 배경은 이런 <근본정신 구조와 기제>다.
즉 <근본 정신구조와 기제>가 이런 잘못된 분별의 바탕이다.
♥Table of Contents
▣- 색의 일부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배경 - 구생기신견
현실에서는 (1!) 부분은 <다른 부분>과 어느 정도 <다른 특성>이 파악된다.
그런데 이는 그가 그렇게 <분별>을 해서 <그런 특성>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주체가 정신없이, 분주히 활동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매 순간 각 부분을 <자신의 몸>이라고 분별할 틈이 없이 분주히 임한다.
그런데 평소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위와 같은 특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어떤 모임>에 나갔다.
그래서 미처 자신의 몸 각 부분을 일일이 <분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자신의 목>이나 <손발>을 떼어 놓고 모임에 가게 되는 경우는 없다.
한편, 아예 <사고>나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해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이 상황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가 그를 간호하며 옆에서 지켜본다고 하자.
그런 <제 3 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1!)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른 <일정한 특성>을 갖는다고 파악된다.
결국 (1!) 부분을 <자신 몸>이라고 분별한다고 하자.
이는 이런 특성에 따른 <후발적인 분별>이다.
그런 결과 <각 부분>을 구분해 관념한다.
이 가운데 (1!)의 부분에 대해 → <'나'>라고 관념한다.
또 다른 (2!) 부분에 대해 → 자신과 의사소통이 되는 <다른 이> 철수라고 여긴다.
또 다른 (3!) 부분에 대해 → 사람과 비슷한 강아지 소 등 <다른 생명체>로 여긴다. 멀리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4!) 부분에 대해 → <무생명체>로서 '바위' 로 관념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눈을 떠 함께 얻는 <감각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처럼 <각 부분>의 특성이 다름을 파악한다.
그런데 이런 특성은 그가 <현실에서 일으키는 분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 부분이 <이런 특성>을 갖는 데에는 배경사정이 있다.
이는 <생을 출발하는 이전 단계>에서 일으킨 <망집>이 그 배경 원인이 된다. [구생기신견]
<생을 출발하는 이전 단계>에서는 <일정한 정신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처음 <근본정신>과 관련해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망집>을 일으킨다.
[제7식의 아치, 아견,아만, 아애]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각 <주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태어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그 <주체>는 <감각현실>을 얻게 된다.
이 때 그가 눈을 통해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특성이 다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후발적>으로 다시 <잘못된 분별>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 <잘못된 망상분별>을 한다고 하자.
그 배경은 이런 <근본정신 구조와 기제>다.
즉 <근본 정신구조와 기제>가 이런 잘못된 분별의 바탕이다.
♥Table of Contents
▣- 잘못된 <신견>의 방치와 생사고통의 문제
태어난 이후 <제6의식>에서 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자신이 얻는 <감각현실> 등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잠재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에서 이뤄진 망상분별에 바탕한다. [구생기신견]
그래서 현실에서 제6의식에서 행해지는 이런 분별은 후발적인 망상분별이다.
[분별기신견]
그러나 이런 후발적 <망상분별>도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된다.
각 주체는 생사현실에서 의식표면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생사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요소>를 취한다.
그리고 이를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자신과 <관련된 것>에 다시 집착한다.
즉,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지위, 명예>... 등에 집착을 갖는다.
이 모든 집착의 <근본>에는 '<자신'에 대한 분별 집착>이 바탕한다.
그리고 그런 <망상분별>에 바탕해 계속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증폭시켜 받아나가게 된다.
그리고 <생사>에 묶이게 된다.
한편, <자신이 얻는 내용> 가운데 <색>을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부분>은 <생사과정>에서 변화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생사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후 이 부분과 <이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신은 <죽음> 이후 아무 것도 없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즉 <단멸관>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짧게 <1생>에 국한해서 <잘못된 목표>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방안>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나'의 정체>를 올바로 관해야 한다.
이 경우 평소 <자신으로 여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자신>이 아님을 이해한다.
따라서 이런 <분별기 신견>부터 <먼저> 잘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집착>을 버릴 수 있다.
또 그런 망집에 바탕해 행하는 <업>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분별기 <신견>이 잘못인 사정
각 주체는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잘못 이해한다.
물론 그 부분은 현실에서 <다른 부분>과 일정하게 <다른 특성>이 파악된다.
그리고 이는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런 분별>은 잘못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런 분별>이 잘못인 사정부터 간단히 살핀다.
♥Table of Contents
▣- <얻어진 내용> 안에 <'그 내용을 얻는 주체'>가 있을 수는 없다.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예 (1!)]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의 한 부분이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런 내용을 얻는 자신'>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이해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를 비유로 이해해보자.
<어떤 그릇>(~정신)에 물건이 담긴다.
그래서 그릇에 <일정한 물건 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물건 가운데 일부>가 <'그런 물건을 모두 담은' 그릇>이라고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와 사정이 마찬가지다.
♥Table of Contents
▣- <관념>은 <감각현실> 등 <다른 영역>에 얻을 수 없다.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여기고 가리킨다고 하자.
그러나 <그 부분>은 <감각현실>이다.
그런데 <감각현실>에서 <관념 내용>은 본래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함은 < 無相解脫三昧무상해탈삼매> 수행과 관련된다.
반대로 <분별>도 마찬가지다.
<분별 내용> 은 그 안에 <감각현실>과 같은 자상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함은 <遍計所執相변계소집상의 相無自性상무자성>을 이해함과 관련된다.
♥Table of Contents
▣- 본바탕인 <실재>에서 얻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그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따라서 <현실내용>은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한편 <실재>는 이를 얻지 못하여 <공>하다. [공]
결국 <현실 내용>은 본바탕인 <실재>에서 얻지 못하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현실에서 화합해 <얻어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현실에서 얻어내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실답지 않다.
따라서 현실에서 <자신이라고 여긴 내용>은 <꿈>과 성격이 같다.
마치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현실은 <실답지 않다>.
♥Table of Contents
▣- 참된 진짜 <실체>가 아니다.
한편 <현실 내용>은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본체>가 아니다.
<감각현실>도 마찬가지다.
<관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참된 진짜의 내용>이 아니다. [비아, 무아, 무자성]
♥Table of Contents
▣- <자신>의 부분이 갖는다고 여기는 <특성>이 있다. - 이는 잘못 파악한 내용이다.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예 (1!)]
이 부분은 현실에서 <다른 부분>과 특성이 달리 파악된다.
<상일성, 주재성, 주관성> 등이다.
그런 특성으로 이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이들 특성을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상일>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다.
한 주체가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일정하게> 하나의 형태로 유지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생로병사> 과정에서 쉼 없이 <변화>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모습>이 <변화>한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내용이 아니다.
한편, 자신이 <눈>을 뜬다.
그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예 (1!)]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신이 <눈>을 감으면 사라진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 <자신>이 없다고 여기는 이는 없다.
따라서 처음 <그런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모두 사정이 이와 같다.
♥Table of Contents
▣- 자신 뜻대로 <주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 주체가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평소 <자신 뜻대로> 변화된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생로병사>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런 생로병사를 <자신이 원해 겪는 것>이 아니다.
한편 <자신 몸으로 여기는 부분>을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 <뜻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도 자신 몸에 들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자신 뜻>과 달리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이를 다음 경우를 놓고 <비유>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평소 <버스>를 운전하고 다닌다.
그런데 앞과 같은 사정으로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렇다면 버스 운전사는 <버스 전체>를 자신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운전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버스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스에 탄 승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승객 개개인>이 내릴 곳에서 내리고 탈 곳에서 탈 것이다.
물론 운전사도 차를 내리고 난 후는 일반인처럼 <자신 몸>만을 자신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만 끌고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7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부분>도 사정이 그와 같다.
몸 안에서 살아가는 <세균>과 <자신>의 관계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몸 안의 세균이나 기생충>은 마치 <몸이라는 버스에 탄 승객>과 같다.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자신>은 마치 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 운전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이 상황에서 <자신>은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그러나 <세균 등 다른 주체>들은 <그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집>이나 <식량> 정도로 여기고 대한다.
한편 이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보는 부분>을 다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정작 <자신의 몸>이라고 할 부분은 거의 남지 않는다.
현실에서 <자신 몸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의 사정이 같다.
평소 자신 몸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일시적으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모두 <자신>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의 감관이 위치한 부분>이 사실은 아니다.
한편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이들 내용>에 '그런 내용을 얻게 한' <감관>이 들어 있을 수는 없다.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내용> 안에 <이를 얻게 한 감관> 즉, <눈>이 위치하지 않는다.
한편 <이들 부분>에 <다른 감각을 얻는 감관>도 위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눈>을 뜬 상태라고 하자.
이 경우 <손>을 내밀어 바위를 만진다고 하자.
그런 경우 <촉감>을 얻는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손 모습>이 <촉감을 얻는 감관>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눈>을 감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들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촉감>은 얻을 수 있다.
결국 <눈을 통해 얻는 내용>은 <시각정보>일 뿐이다.
이런 <시각 정보>가 <촉감을 얻는데 관계하는 감관>이 아니다.
나머지 <귀,코,혀를 통한 감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각정보가 이들 감각을 얻는 데 관계하는 감관이 아니다.
다른 <감각현실>도 사정이 같다.
<눈을 떠 얻는 내용>에서 살핀 내용과 사정이 같다.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보>에 <감관>이 들어 있지는 않다.
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결국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자신의 <감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색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 - 그림을 통한 설명
자신이 <눈>을 뜬다.
그래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잘못>임을 살피려 한다.
이 경우 먼저 <다른 이>의 판단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잘못인 사정>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가 <감각하는 과정>의 관찰
<다른 이> 철수를 옆에 둔다. [예 (2!)]
그리고 자신은 그런 철수가 <감각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예를 들어 철수에게 눈>을 감고 뜸을 반복하게 한다.
그리고 철수가 <그 때마다 얻는 변화>를 자신에게 <보고>하게 한다.
그런 경우 <철수>는 다음처럼 보고한다.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무언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철수가 <눈>을 감는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철수가 <눈>을 뜨고 감고를 반복한다.
그 때마다 철수는 <그런 내용>을 반복해 보고할 것이다.
그런데 1이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다.
이 경우 1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즉, 철수가 무엇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1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 나타난 것>이 없다.
또 철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경우 <1 입장>에서는 무언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없다.
따라서 <그런 변화>는 오직 <철수 영역에서만 일어난 변화>로 추리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가 감각하는 내용은 <다른 이 내부>의 변화다.
예를 들어 <철수가 감각한 결과>는 <철수 내부에서의 변화>다.
철수가 무엇이 <보인다>고 보고한다.
이 때 <철수>가 정확히 <무엇을 얻는가>는 <다른 이>는 알 수 없다.
직접 <그 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언어보고>를 통해 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1은 이런 실험을 통해 다음처럼 추리한다.
철수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이 경우 철수가 <무언가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이 경우 이는 <철수 영역>에서 <철수만 얻는 내용>으로 추리한다.
그래서 <철수의 머리>(마음)부분에 <그 내용>이 위치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위 <그림> (5^) 형태처럼 얻는다고 추리한다.
그래서 1은 이 상황을 위 그림처럼 표시해 나타낸다.
그러나 정확하게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판단> 역시 <잘못>된 추리임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이 <철수라고 보는 부분>이 잘못이다.
위 <철수라고 보는 부분>도 <1이 얻어낸 내용>이다. [에: (2!)]
<1이 얻은 내용>에 <다른 주체>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그래서 <철수가 얻는 내용>이 <그림>에서 (2!) 부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다른 사람> 철수는 <1이 얻는 내용> 밖에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철수가 <어떤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그것은 결국 위 <그림>에 표시한 형태로 추리할 수는 있다. [예 (5^)]
즉 <철수가 대한 외부 대상>과 <철수의 주관>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를 통해 철수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경우 <그 내용>은 대강 위 그림과 같다고 추리할 수 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 정확한 위치는< 1이 얻는 내용> 안이 아닌 것뿐이다.
그래서 <그림>에서 <그런 내용>이 (2!) 부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Table of Contents
▣-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 - <이 부분>은 <자신>이 아니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이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이 경우 먼저 <다른 이> 철수가 <판단하는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그런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하기 더 쉽다.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 (5^)]
그런 경우 철수는 이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예 (2^)]
그런데 <1 입장>에서 이를 검토해보자.
<철수가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2가 얻어낸 내용>일 뿐이다. [예 (2^)]
<그런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을 얻어내는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오히려 <실질적인 철수>는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예 (5^) 내용 밖]
그래서 <철수의 처음 판단>은 잘못이다.
<철수의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자신>도 <철수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
즉 <자신>도 스스로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이 과정이 <철수>와 형태가 같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자신에 대한 판단'>도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1 자신>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예: (1!)]
그런데 <1 자신의 관찰이나 판단과정>은 <철수>와 같은 형태다.
따라서 이 경우도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할 수 있다 .
만일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최소한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얻어낸 내용>은 위 그림 전체다. (5!)
따라서 <자신>을 찾는다면, 위 그림 (5!)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각 주체는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를 각기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런 사정을 <눈>을 뜨고 얻는 <감각현실>을 놓고 먼저 살폈다.
그런데 나머지 <색ㆍ수ㆍ상ㆍ행ㆍ식> 내용도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취해, 그런 내용을 곧 <자신>이라고 관념을 일으킨다.
그러나 <앞과 같은 사정>으로 이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실질적 자신>으로 보아야 할 부분
평소 <자신이 얻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제 이런 부분대신, '<진정 자신으로 여길만한 부분>'이 문제된다.
그래서 <진정 자신으로 여길만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나가야 한다.
비유를 들어보자 .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벽돌>을 <자신>으로 잘못 여겨왔다.
그런 경우 벽돌은 <자신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벽돌은 벽돌일 뿐 <자신이 아님>을 먼저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벽돌이 <자신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이제 대신 <자신으로 여길 내용>은 다시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생사윤회의 주체>를 살피는 데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생사 과정에서 무엇이 <생사과정>을 이어나가게 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실험을 해보자.
처음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겼다고 하자.
<그런 부분>은 늘 자신이 일정하게 대한다고 잘못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내용은 갓난아이- 어린이 - 청장년- 노인의 형태로 <변화>한다.
그런 부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자신이 지금 37살 정도라고 하자.
이 경우 <자신으로 파악한 내용>을 <자신>으로 파악한다고 하자.
그런데 자신이 <아이> 때에도 <그처럼 자신으로여긴 부분>이 있었다.
이 <두 내용>을 놓고 비교해보자.
그런데 <이들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어떤 <한 정지단면>의 내용을 <자신>으로 정한다고 하자.
그 후 10여년이 지난다고 하자.
그런 경우 <10년 전 상태>는 이미 없어져 사망한 것과 같다.
그런데 <과거의 자신>에 대해 장례식도 치루지 않는다.
그리고 태연하게 생활을 이어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를 아쉬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를 놓고 매 순간 슬퍼하며 지내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그 주체는 <사망>했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여긴다. [단멸관]
그러나 <그 사정>이 그렇지 않다.
평소에도 <자신으로 여긴 부분>은 <다른 부분>처럼 매순간 들고 난다 .
다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일정 부분>은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 주체는 <이들 내용>을 모두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자신>으로 여기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생로병사 <변화과정의 모습>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를 모두 <자신>의 내용으로 여긴다고 하자.
이 경우 이들 내용에 <계속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요소>가 있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이들 각 내용을 다 함께 <자신>으로 여긴다고 여기기 쉽다.
또는 전후 과정의 <유사성> 때문에 이를 모두 자신으로 여긴다고 여기기 쉽다.
또는 전후 과정이 <인과관계>로 묶여서 이를 모두 자신으로 여긴다고 여기기도 쉽다.
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 주체의 <변화과정>을 우선 살펴보자.
이를 다음처럼 비유로 이해해보자.
어떤 이가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든다.
처음 한 쪽에 <파란 블록>으로 <사람 모습>을 만들었다.
그리고 옆에 <흰 블록>들로 <양배추 모습>들을 만들었다.
그 후 <사람 모습>에서 부품을 하나씩 조금씩 떼 <양배추 모습>에 옮겨 붙인다.
또 반대로 <양배추 모습>에 있던 부품은 <사람 모습>으로 옮겨 붙인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형태를 구성한 <부품>은 다 밖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밖에 있던 <부품>들이 원래의 형태에 붙여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흰 블록>으로 바꿔진다고 하자.
그리고 <양배추>는 모두 <파란블록>으로 바꿔진다고 하자.
이 경우 <부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가운데 <파란 부품>들은 처음 <사람 모습>이었다가 <양배추 모습>들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자.
그 경우 사람이 점점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품>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하나의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한편 <인과관련성>을 살핀다고 하자.
이 경우 이들은 다 함께 모두 <인과>로 얽혀 있다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간>만 놓고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변화 전후>에 걸쳐 <공통성>, <유사성>, <인과관련성>이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이들을 모두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 각 경우 <다음 문제점>이 있다.
♥Table of Contents
▣- 공통 요소
생로병사 <변화과정>의 <모습>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를 모두 <자신>의 내용으로 여긴다.
이 경우 이들 내용에 계속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요소>가 있다고 여긴다고 하자.
이런 경우 <생로병사>나 <생사 왕래 과정>을 다음처럼 이해하게 된다.
<자신을 특징짓는 핵심요소>로 <어떤 A>가 있다.
<이런 A>가 생로병사 과정을 거쳐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그가 5살에서 80살이 되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5살 때의 A>가 <80살 때의 A>로 이동해 옮겨 왔다 .
<나머지>는 여기에 붙여진 <옷>이나 <장식>과 비슷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변화 전후에 걸쳐 매번 그 <형태>나 <구성부품>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형태>나 <구성부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일정하게 유지한 <어떤 한 요소>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일정한 공통요소>로 이들을 자신으로 여긴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생로병사> 변화과정에서 <어느 경우나 공통된 요소>는 찾을 수 없다.
즉 <육체적 내용>이나 <구성 물질>이 완전히 다르다.
또 <정신적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처음 형태>가
그 뒤에 하나씩 부품이 떨어진다.
그리고 <새로> <숫자 부품>이 붙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뀐다.
abcdefghij
bcdefghij1
cdefghij12
defghij123
efghij1234
fghij12345
ghij123456
hij1234567
ij12345678
j123456789
1234567890
즉 <처음 형태를 구성한 부품>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새 부품>으로 모두 교체된다.
현실 삶에서 이런 과정이 <호흡과 식사 흡수 배설> 과정에서 이뤄진다.
<정신적 내용>도 이와 사정이 같다.
20년 전 30년 전 <당시 자신이라고 본 모습>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꾸준히 거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5살 때 몸>이나 <17살 당시 스스로 자신이라고 여긴 몸>이 있다.
이들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내용물>도 바뀌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 꾸준히 존재하는 일정한 요소>를 찾아내기 곤란하다.
따라서 <어떤 일정한 공통된 요소>가 있어 이들 모두를 <자신>으로 여긴다고 할 수 없다.
♥Table of Contents
▣- 유사성
한편 변화과정 <전후>를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변화 <전>과 변화 <후>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통해 이들을 모두 <자신>으로 여긴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청장년 시기의 <자신>과 유사한 이는 오히려 <다른 청장년>이다.
한편 갓난아이 시절의 <자신>과 유사한 이는 오히려 <다른 갓난아이>들이다.
<쌍둥이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은 많은 <갓난아이> 가운데 오직 <특정한 갓난아이>만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동일성>이나 <유사성>으로 이들을 모두 자신으로 본다고 여기기 힘들다.
♥Table of Contents
▣- <인과관계> 전후 연결성
한편 한 주체의 <변화과정>을 살핀다고 하자.
이 경우 이 과정은 육체에서는 <식사-소화-흡수-배설>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를 엄밀하게 보면 <호흡>을 한번 들이 쉬고 내 쉬는 사이에 달라진다.
그리고 <정신>에서도 이에 준한 활동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어떤 <소설>을 읽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용을 이해해 <일부 내용>은 <섭취>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내버리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가운데 정신 내 <의식 내용>이 점차 달라진다.
그래서 <외국어>와 <수학>, <과학> 지식을 습득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지 못한 상태>와는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변화 <전>과 변화 <후>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과관련성>을 통해 이들을 모두 <자신>으로 여긴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주체는 <변화 과정>에서 식사 전에 있던 <식품>을 자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배설 후 배설된 <소대변>을 자신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정신적 내용>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5살 때 읽어 익힌 동화책>을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써서 출판한 소설>을 자신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다.
♥Table of Contents
▣-<변화과정>에 <계속 존재하는 내용>을 찾아내기
의식 표면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하여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그 모습>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들 모든 변화 모습>을 모두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
이 경우 변화 전후에 걸쳐 <공통성>, <유사성>, <인과관련성>이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이들을 모두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인 관찰>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실험을 해보자.
처음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으로 여겼다고 하자.
그런데 이제 <눈>을 감는다.
그러면 <처음 자신으로 여긴 부분>은 이제 사라져 없다.
그래도 <자신>은 여전히 있다고 여긴다.
이런 경우 <눈>을 감아도 <계속 있다고 할 자신>은 대신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무언가>를 <자신>으로 취한다고 하자.
다만 그것이 무언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U로만 막연하게 표시해보자.
이 U는 <전후 과정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U를 앞에서 <눈을 떠 자신으로 여긴 내용>과 비교해보자.
이 경우 이 U는 그런 내용과 <공통성, 유사성, 인과관련성>이 모두 모호하다.
한편, 또 다른 <감각현실> 경우도 마찬가지다. [광의의 색: <색ㆍ성ㆍ향ㆍ미ㆍ촉>]
그래서 <다른 감관>을 다 <닫는다>고 하자.
그래서 <다른 감각>도 얻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자신>은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있다고 할 자신>은 대신 무언가를 파악한다.
한편, <수ㆍ상ㆍ행ㆍ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자신이 <현실에서 얻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얻지 못해도 여전히 <자신>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식을 상실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계속 있다고 할 자신>이 무언가를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사과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해, 사체를 불에 태워 <화장>을 한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이 전후과정에 걸쳐 <계속 이어지는 자신>이 무언가를 파악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의 시설 문제
한 주체가 <일정한 변화>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걸쳐 <계속 유지되는 무언가>를 U로 표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U 의 정체를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처음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과정>부터 살펴야 한다.
<눈으로 보는 내용>이 있다.
<이들 내용>은 수없이 변화한다.
그런 가운데 작용하면서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내용>을 찾는다고 하자.
이 경우 이 과정에 작용하는 <마음>을 처음 시설하게 된다.
다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마음>을 처음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자세한 내용은 『수능엄경』부분에 제시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설하게 된다.
처음 <눈>을 통해 <무언가를 보는 과정>이 있다.
<이에 작용하는 마음>을 <제1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제1식>이 없다고 먼저 가정한다.
그런 가운데 <이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 경우 외부 물질과 육체의 <자극 반응관계>로만 이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 상태>는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
또 <외부상황>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 한 주체는 이 관계에서 그 결과로서 매 경우 <일정한 감각>을 일으켜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인식과정>을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들 내용>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 곤란하게 된다.
즉 <같은 주체>, <같은 상황>에서도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기도 하고 또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설명하려 한다고 하자 .
그런 경우 이에 관계하는 <제1식>을 '있다'고 해야 한다.
즉 이런 현실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1식의 마음>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를 <소리>를 듣는 과정을 놓고 이해해보자.
이런 경우에도 <외부 물질>과 <육체>의 <자극 반응관계>로만 이를 이해할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마음의 존재>를 통해 이해할 입장도 있다.
위 두 입장의 차이를 『수능엄경』에서 다음처럼 구별해 표시한다.
'소리가 <난다>'.
'소리가 <들린다>'.
현실에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종>을 흔들 때 종소리가 나는 운동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다시 <육체 내 물질>의 <자극 반응관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이가 <종소리>를 듣는다고 하자.
이를 <외부물질>과 <육체>의 <물질적 반응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종>을 막대로 때려 소리가 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주체>는 늘 일정하게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종소리가 <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위와 같은 관계>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설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소리를 듣는 과정에 개입하는 <마음의 존재>를 있다고 시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종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내용>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살펴나가기로 한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제4권)
여하튼, <감각>에 관여하는 <제1식~제5식>을 처음 이런 사정으로 시설한다.
이후 <분별>에 관여하는 <제6식>도 마찬가지다.
이 제6식의 시설도 사정이 같다.
분별과정을 앞에 시설한 <5식>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제6식을 시설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6식을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한편 이후 <제7식의 시설>도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의식을 상실했다가 회복하는 경우를 놓고 보자.
의식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자.
이런 경우 <앞의 6식>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주체가 일정한 기능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호흡도 하고 심장도 작동한다.
이 상태를 앞에 시설한 6식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제7식의 시설>은 필요 없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제7식을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성유식론』 제5권에서는 제7식을 시설할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2교6리二敎六理)【b】
【b】 { K0614V17P0545a12L; 已引聖教當顯正理謂契經說不共 無明微細恒行 『성유식론』(成唯識論), 제5권, 호법등보살조. 당 현장역(護法等菩薩造. 唐 玄奘譯), K0614, T1585 }
즉 경전상 내용으로 먼저 『입능가경』 권9, 『해탈경』을 든다. [경증]
그 외 먼저 범부에게 간단없이 <무명>이 상속하는 현상을 제시한다.
그런데 앞 6식은 자주 끊긴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려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제7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불공무명증不共無明證]
한편 제6식의 의근으로 제7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육이연증六二緣證]
그리고 제7식을 나타내는 말나라는 명칭자체가 항심사량(恆審思量)임을 든다.[의명증意名證]
한편 수행에 있어 멸진정과 무상정이 구분된다. 이 구분을 위해서는 제7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2정차별증二定差別證]
무상천에서는 제6식이 없다. 그러나 아집 현상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7식이 필요함을 든다. [무상유염증無想有染證]
한편, 범부가 선을 행해도 아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7식이 필요함을 든다. [유정아불성증有情我不成證]
이처럼 현실에 여러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앞 6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제7식이 '있다'고 시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다만 이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한다.
한편 <제8식을 시설하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장미꽃을 대한다.
그러면 장미꽃과 관련된 과거 일을 떠올린다.
이 경우 스스로 그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일임을 함께 의식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앞 7식들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제8식을 굳이 시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 사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8식을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제8식을 시설할 사정에 대해서도 역시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 등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c】【d】
【c】 { K0570V15P0901c16L; 執受 初 明了 種子 業 身受 無心定 命終 無皆不應理 由八種相證阿賴耶識決定是有謂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51권 미륵보살설. 당 현장역(彌勒菩薩說. 唐 玄奘譯), K0570, T1579 }
【d】 { K0614V17P0529a10L; 云何應知此第八識離眼等識有別 『성유식론』(成唯識論), 제3권 호법등보살조. 당 현장역(護法等菩薩造. 唐 玄奘譯), K0614, T1585 }
【주석끝】---
『유가사지론』 제51권 부분에는 이와 관련해 <8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즉, 집수(執受)와 처음[初]과 명료함[明了], 종자(種子)와 업(業)과
몸의 느낌[身受]과 무심정(無心定)과 목숨의 마침(命終)을 든다.
다만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하튼 이런 사정으로 제1식부터 제8식을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이들을 발생적으로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이들 관계를 <역순>으로 제시해야 한다. [3능변]
즉 이숙능변(異熟能變)ㆍ사량능변(思量能變)ㆍ요경능변(了境能變)의 관계로 제시한다.
이숙능변(제1능변)은 제8식과 관련된다.
사량능변(제2능변)은 제7말나식과 관련된다.
요경능변(제3능변)은 제6의식과 5식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처럼 <식>이 <분화 생성>된 상태에서 <삶>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현실 상태에서 이들 <식의 각 내용>을 찾아 시설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얻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역순으로 시설해나가게 된다.
이는 마치 물건을 조립하고 분해하는 과정과 같다.
조립된 물건을 <분해>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는 처음 부품을 <조립>할 때의 순서와 <역순>이 된다.
♥Table of Contents
▣-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와 <실질적 자신>의 시설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잘못 여긴다. [상일성]
또 <자신의 뜻>>에 따라 변화된다고 잘못 여긴다.[주재성]
그리고 대상을 대하는 <주관>이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주관]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정도 이에 가까운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즉 <평소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어느정도 특성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일정한 배경사정>이 있다.
이는 <생을 출발하는 이전 단계>에서 일으킨 <망집>이 그 배경 원인이 된다. [구생기신견]
한 주체는 <생의 출발 이전 단계>에 <일정한 정신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임한다.
그린데 그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망집>을 일으킨다.
즉, 처음 근본정신과 관련해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취한다. [제7식의 아치, 아견,아만, 아애]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이후 <그 주체의 기관>과 <나머지 식>이 분화 형성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그 주체는 <감각현실>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그는 눈을 통해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 경우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은 < 나머지 다른 부분>들과 특성이 다름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후발적으로 다시 <잘못된 분별>을 행하게 된다.
즉 그는 다시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기며 현실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매순간 그처럼 스스로 자신으로 취하는 부분>을 붙잡는다고 하자.
그리고 이들 내용을 이어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한 생에서 자신의 <생로병사 과정>으로 여기게 되는 내용이 된다. (갓난아이 ~노인)
또 이는 더 나아가 <생사 전후 과정에 이어지는 생사윤회의 내용>도 된다.
<갓난아이 때 모습>과 <청장년시절>, <노인시절의 모습>은 다 다르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한 주체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런 사정이다.
그 경우 이런 각 내용을 매 순간 얻게 하는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가 있다.
그런데 <상일성>, <주재성>, <주관성>으로 자신을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차라리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실질적 자신>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곧 <생사윤회 과정에서의 실질적 주체>로 보게 된다. [보특가라]
그런데 앞에서 <분별기 신견>이 잘못인 사정을 살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 내용>이 다시 관련된다.
이를 다시 살펴보자.
우선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파악하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를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간략하게 앞에서 살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각 마음을 <일정한 언어>로 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어 '제8아뢰야식' '제7말나식' 이런 표현과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일정한 <관념적 분별>을 행한다.
이런 경우 <그런 언어표현>은 <일정한 영역의 일정한 내용>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일정한 관념으로 가리켜> <취하는 상相>이 있게 된다. [보특가라상]
그래서 여전히 그런 관념[想]에 바탕해 <잘못 취하는 상>(相 Lakṣaṇa )의 문제가 있다.
[참고 ▣- 무상삼매 ]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리킨 그런 영역 그 부분)에 <그런 언어표현>이나 <그런 관념적 내용> 자체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표현>과 <그런 표현이 가리킨 부분>은 서로 구분해야한다.
한편 이들은, <본바탕인 실재>에서 얻을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이들은, 참된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실체>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참되고 실답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꿈과 성격이 같다.
처음 <분별기 신견>을 일으킨 경우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
즉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여기며 집착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업>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다시 <참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역시 이에 대해 <집착>을 갖고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업>을 행하게 된다.
결국 처음 <분별기 신견>의 문제가 이 부분으로 옮겨 오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경계>하는 내용이 나온다.
...
아타나식(阿陀那識) 매우 깊고 미세해
일체 종자 폭포의 흐름 같도다.
내가 어리석은 이들에겐 말하지 않나니
그들이 분별하여 아(我)라 할까 두렵구나.
....
(『해심밀경』 1권 3. 심의식상품心意識相品)
♥Table of Contents
▣- 자신의 <현상적 본 정체성> - <정신>과 <육체>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일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예 (1!)]
그런데 이 경우 <그런 내용 일체를 얻어낸 마음>을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일정한 내용을 담는 그릇>(~정신)처럼 표시한다고 하자.
그 경우 <눈으로 내용을 얻는 이 전체 부분>을 <그런 그릇>(~정신)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 [예 (5!)]
그리고 이들 <마음>을 오히려 <주체의 실질적 부분>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두 부분>은 서로 <분리>된다. [예 (1!)와 (5!)]
<나머지 8식>도 마찬가지다.

[img8]
08pfl--image/8식-8.jpg
<마음>은 <마음 안>에 <내용>을 얻어 보여준다.
그러나 <마음>이 <마음>을 직접 보지는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마음>은 정작 형체가 없다.
<마음>을 <그릇>(~정신)으로 비유해보자.
또는 <거울>로 비유해보자.
이 경우 <그릇>이 <자기 자신 그릇>(마음)을 담지 못한다.
또 <거울>이 »거울 자신>(마음)을 비춰 보여주지 못한다.
<마음>이 한편 <평소 자신이라고 여기는 부분>과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경우 <마음>은 <이들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테두리>처럼 여긴다. [예(5!)]
그러나 <마음>은 그런 <크기>나 <형체>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좁은 상자> 안을 바라본다고 하자.
그렇다고 <마음>이 <상자 크기>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 자신이 <하늘과 바다>를 바라본다고 하자.
그렇다고 <마음>이 <하늘과 바다 크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한편 <마음>은 <어떤 내용을 얻는 상황>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기기 쉽다.
예를 들어 <일정한 모습>을 지금 본다.
이런 경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그러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 마음>도 사라져 없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 내용>을 얻거나 얻지 않거나 일정하다.
예를 들어 <눈>을 감아 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눈>을 뜬다.
이 경우 <눈>을 감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없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눈>을 뜬다고 하자.
이 경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눈>만 뜬 것이다.
그래서 보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눈>을 뜨면 보게된다.
이런 경우 <마음>이 없어도 보게 되는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처음부터 <마음> 없이 볼수 없다는 <생리학자의 입장>과 같아진다.
그 주장의 부당함은 따로 살핀다.
그래서 결국 <마음>은 <마음>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해야 한다.
한편 <마음>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한편 이 상황에 <그런 내용을 얻는 마음>을 시설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둘 가운데 무엇>을 <자신의 본 정체>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수능엄경』에서는 이에 대해 <주인>과 <손님>의 비유를 든다.
그리고 이 관계를 설명한다.
어느 집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은 <주인>이다.
그 집안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은 <손님>이다.
<눈>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얻는 <마음>이 있다. [예 (5!)]
<이처럼 얻어낸 내용 가운데 일정 부분>을 평소 <자신>이라고 이해한다. [예 (1!)]
그리고 <나머지 모습 부분>을 <타인>이나 <외부 세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들 전체>는 <마음>에 들고 난다.
한편 어떤 이가 여행을 다닌다고 하자.
그런 경우 얻는 <외부 세상 모습>의 배경 내용들이 달라진다.
한편, <평소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외부세상>과 달리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대부분 <이런 부분>을 <자신>으로 여기고 대한다. [예 (1!)]
단기간만 보면 이는 비교적 일정하다.
하루 밤 사이에 아이가 노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 역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변화한다.
그리고 <눈을 뜨는 상황>에서만 잠시 맺혔다가 <눈을 감는 상황>에서는 사라진다.
그래서 <손님>과 같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일시적이고 흔들린다.
그래서 <마음 안>의 <손님>이다.
그리고 <주인>이 아니다.
이에 반해 <마음>은 늘 유지된다.
그 안에 <모습>이 맺히거나 맺히지 않거나 관계없다.
그래서 이를 <주인>이라고 본다.
다만, <마음>은 스스로 보지 못한다.
즉, 평소 마음 자체는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런 마음>을 <자신의 본 정체>로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런 가운데 각 주체는 현실에서 마음을 통해 <일정한 내용>은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거꾸로 <자신>으로 여긴다.
이는 이런 면에서 <뒤바뀐 전도 망상>의 하나다.
♥Table of Contents
▣- <실질적인 자신>과 <현상적 자신>의 관계
한 주체는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매 순간 <표면의식>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붙잡아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매 생 <생로병사 과정으로 변화하는 자신>과 <외부세상>으로 <평소 여기고 대한 모습>들이 된다.
그리고 이런 <생사과정>에 늘 유지되는 것이 <근본정신>이다.
따라서 차라리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그런 <실질적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예: (1!)]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 자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는 비유하여 <실질적 자신>이 매 순간 걸치는 <옷>과 같다.
그래서 <실질적 자신>이 갖는 속성이 이 <옷>에서도 유사하게 찾아지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런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근본정신의 구조>와 <이들 부분>은 그처럼 관계된다.
따라서 <그 배경 사정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로 여기는 부분> - 이 부분은 <다른 이>가 아니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한편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다시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로 잘못 여긴다.
이는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기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판단>도 역시 잘못이다.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안에 <다른 주체> 철수나 영희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이 판단도 <다른 이> 철수의 판단과정부터 검토해보자.
그러면 이해가 쉽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위 그림을 놓고 생각해보자.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철수>가 <다른 사람 1이나 영희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 [예 (1^), (3^)]
<이런 내용>을 놓고 <1 입장>에서 이를 검토해보자.
철수가 <다른 사람 1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철수가 얻어낸 내용일 뿐이다. [예 (1^)]
그런데 <철수가 얻은 내용> 안에 <1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만일 <그런 내용>이 정말 <1 자신>이라고 하자.
<철수>가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하자.
그런 경우 <1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 <1 자신>은 사라져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철수가 일정한 내용을 얻던 얻지 못하던, <1 자신>은 그와 관계없다.
그래서 처음 행한 <철수의 판단>은 잘못이다.
만일 <철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내용>은 최소한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 (5^) 내용 밖]
이처럼 <다른 이 철수가 행하는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자신>도 사실은 <철수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평소 판단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판단>도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눈>을 뜬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자신이 <다른 이> 철수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예: (2!)]
그런데 <이런 관찰이나 판단>은 앞에서 <철수가 행한 판단>과 방식이 같다.
따라서 이 경우도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즉,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그리고 그 주체의 <마음에서 얻는 마음내용>이다.
<이런 내용>에 <다른 주체>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따라서 이런 판단은 <잘못>이다.
자신 입장에서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를 찾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최소한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예 (5!) 내용 밖]
자신이 <평소 다른 이 철수나 영희라고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곧 철수나 영희라고 여긴다.
이런 판단은 모두 <잘못>이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이 <다른 이 철수로 보는 부분>- 이는 <철수의 외부 실재>가 아니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처음 각 주체가 제각각 <자신으로 보는 내용>을 살폈다.
자신이 <눈>을 뜬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예: (1!)]
한편 <철수>도 마찬가지다.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철수는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철수는 스스로 <철수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예: (2^)]
그런데 한편 각 주체가 제각각 <다른 이로 여기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 각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뜬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철수로 잘못 여긴다. [예: (2!)]
그런데 <철수 자신이 스스로 철수로 여기는 부분>이 또 있다. [예: (2^)]
<그림>에서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사실상 위치가 다르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모두 다 함께 잘못이다.
즉 이들은 모두 <철수에 대한 잘못된 분별>이다.
먼저 <철수가 행한 판단>을 1이 검토해본다고 하자.
이 경우 <철수가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예: (2^)]
이는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안에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진정한 철수가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예: (2^)는 철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신>은 다시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이 처음에 철수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예: (2!)]
이 경우 <이 부분>은 <철수가 스스로 자신으로 보는 내용>과 다르다.
이는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 아니다.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철수에 해당하는 '외부 실재'>인 것으로 잘못 여기기 쉽다.
<철수가 얻어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이 얻어낸 내용>은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낸 내용 가운데 평소 철수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진정한 철수인 것처럼 잘못 여기기 쉽다.
그리고 <철수의 외부 실재>인 것으로 잘못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내용도 앞과 사정이 같다.
이 내용은 <1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안에 <다른 주체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진정한 철수>를 찾으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먼저 최소한 <철수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또 한편 다시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서 이를 찾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 안에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정을 다음 방식으로 살핀다고 하자.
즉, 거꾸로 <다른 이 철수 입장>을 놓고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철수가 거꾸로 <1의 정체>를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입장>에서는 스스로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긴다. [예 (1!)]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 이와 다른 부분을 1 로 여긴다. [예 (1^)]
이 경우 <철수 입장에서 1의 판단>을 검토한다고 하자.
이 경우 철수는 다음 사정을 쉽게 이해한다.
<1이 얻어낸 내용 안>에 1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따라서 <1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는 부분>은 <진정한 1>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리고 거꾸로 <철수가 1이라고 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잘못 오해하기 쉽다. [예 (1^)]
그런데 <이런 철수의 생각>을 다시 1이 검토한다고 하자.
<철수가 1이라고 본 부분>은 7철수가 얻어낸 내용>일 뿐이다. [예 (1^)]
<그런 내용> 안에 <1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따라서 <그런 철수의 판단>이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 <자신이 행한 판단>도 이와 형식이 같다.
따라서 처음 <자신이 행한 판단>도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다른 이 철수라고 보는 부분>도 진정한 철수가 아니다. [예 (2!)]
결국 <자신이 평소 철수나 영희라고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물론 이는 <철수나 영희의 마음 밖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철수나 영희의 실재내용>이 아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기 때문이다.
♥Table of Contents
▣- <자신 외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좁은 의미의 색]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신견- 예: (1!)]
그리고 <그 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외부세상- 예: (2!) (3!) (4!)]
또 이 내용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외부의 객관적 실재]
즉, 철수나 영희 등을 포함해 모든 이가 함께 대하는 <외부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한편 이 상황에서 자신이 꽃을 <손>으로 만져 <촉감>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자신의 감관>이라고 잘못 여긴다.
[감관의 위치-예: (1!)의 일부분 눈,코,귀,혀,손발 ]
또 감관이 상대한 <외부대상>도 잘못 판단한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자신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객체)으로 잘못 여긴다.
[감각시 대하는 외부대상-예: (3!), (4!) 영희, 꽃, 산 등 ]
이는 <운동 동작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이 <자신의 손발> 등이라고 잘못 여긴다.
[동작기관의 위치- 예: (1!)의 일부분 손발 ]
또 그 손발이 상대한 <외부대상>도 잘못 판단한다.
이 때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동작의 <외부 대상>(객체)으로 잘못 여긴다.
[예: 동작의 대하는 외부대상 (3!), (4!) 영희, 꽃, 산 등 ]
한편 <감각해 얻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관련해서도 잘못 판단한다.
처음 자신이 대한 <외부 대상>을 잘못 판단한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자신이 눈을 떠 얻어낸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은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는 곧 <자신의 감관이 대한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은 완전히<일치>한다.
그래서 <자신이 감각한 내용>이 <대상>에 대해 <옳은 내용>을 얻은 것으로 잘못 여긴다.
이는 <하나의 내용>에 <2개의 다른 지위>를 부여했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감각현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한편 이를 <외부 물질>로 여긴다.
이는 이들 <감각현실>이 <느낌, 분별>과 달라서, <정신적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는 이들은 <정신과는 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보는 입장이다. [외부<물질>]
다만 <물질>은 <정신>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마음>을 먼저 시설해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따로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판단들>이다.
이들 내용은 그 모두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그가 얻어낸 내용> 안에 <그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또 <그가 얻어낸 내용>에 <그 자신 밖 외부 세상>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이하 판단>들도 사정이 같다.
중복을 피하여 <이들 판단이 잘못인 사정>은 아래에서 함께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의 <외부>에 대한 판단
자신이 <자신> 및 <외부 세상>에 대해 여러 판단을 잘못한다고 하자.
이 경우 <다른 이 철수>와 <철수 외부의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잘못된 판단을 행한다.
우선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일정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고 하자.
이 경우 이에 준해 자신은 <다른 이 철수>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한다.
우선 <자신이 얻은 내용 일부분>이 <그런 철수>라고 여긴다. [예: 철수 (2!)]
그리고 이 경우 <그 나머지부분>을 역시 <철수가 대하는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예: (3!), (4!)]
또 <이런 나머지 부분>을 자신과 철수가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한편 이 상황에서 철수가 꽃을 <손>으로 만져 <촉감>을 얻는다고 하자.
이것을 자신이 <철수의 외부>에서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철수의 감관>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
즉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철수의 감관>이라고 잘못 여긴다.
[예: 철수의 감관: (2!)의 일부분 눈,코,귀,혀,손발 ]
또 철수의 감관이 상대한 <외부대상>도 잘못 판단한다.
즉,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철수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객체)으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가 감각시 대하는 외부대상 (3^), (4^) 영희, 꽃, 산 등 ]
이는 <운동 동작>시도 마찬가지다.
철수가 손과 발로 <동작>을 취한다고 하자.
이 때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철수가 행한 동작의 대상>(객체)으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의 동작시 대하는 외부대상 (3^), (4^) 영희, 꽃, 산 등 ]
한편 <철수가 감각해 얻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관련해 판단한다고 하자.
철수가 <눈>을 뜬다고 하자.
그러면 무언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철수가 <눈>을 감는다고 하자.
그러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신이 관찰한다고 하자.
이 경우 자신에게서는 <별다른 변화>가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변화>는 오직 <철수 내부에서의 변화>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철수로 잘못 보는 부분>이 있다. [예: 철수 (2!)]
그래서 <철수가 얻는 내용>은 <이런 철수 부분> 안에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데 이 경우 <철수가 눈을 떠 얻어낸 내용> 자체는 자신에게는 숨는다.
그래서 <철수가 눈을 떠 얻어낸 내용>을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이 경우 처음 <철수의 감관이 대한 대상>을 앞처럼 잘못 판단한다고 하자.
그래도 이 경우는 <대상>과 <철수가 그에 대해 얻는 내용>이 분리된다.
그래서 자신의 경우와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4!) 부분을 놓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이 부분이 갖는 지위>를 자신은 다음처럼 생각한다.
이는 <자신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라고 먼저 잘못 생각한다.
한편 <다른 이 철수>를 놓고는 다시 다음처럼 잘못 생각한다.
이는 <철수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이다.
이렇게 그 지위를 잘못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그런데 이 경우 철수가 얻어낸 <감각현실>은 자신에게 직접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경우에만 <대상>과 <감각현실>이 일치한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한편 <다른 이 철수>의 경우에는 <대상>과 <감각현실>은 일단 분리된다.
그래서 자신의 경우와는 달라진다.
여하튼 이처럼 <다른 이 철수>와 관련해 여러 판단을 행한다.
그런데 <이들 판단>은 모두 잘못이다.
이들 내용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안에 <다른 이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이하 판단>들도 사정이 같다.
중복을 피하여 이들 판단이 <잘못인 사정>은 역시 아래에서 함께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 철수>가 행하는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
<이런 여러 판단>이 <잘못>인 사정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다른 이 철수>를 놓고 판단하면 이해가 쉽다. …
이를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자.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현실에서 <다른 이 철수>가 감각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한다.
<이 내용>을 자신이 보고받아 판단을 해보기로 하자.
우선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무언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철수는 <그 가운데 일부분>을 스스로 <철수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 자신의 몸: (2^) ]
그리고 얻는 내용 가운데 <그 나머지 부분>을 <철수 자신 밖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 자신이 대하는 외부세상: (1^), (3^), (4^)]
그리고 이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즉, 영희 등을 포함해 <모든 이가 함께 대하는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한편 <철수>가 <꽃>을 <손>으로 만져< 촉감>을 얻는다고 하자.
이 경우 <철수>는 <철수 자신의 감관>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
<철수>는 <철수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이 <철수 자신의 감관>이라고 여긴다.
[예: 철수자신의 감관: (2^)의 일부분 눈,코,귀,혀,손발 ]
또 <감관이 상대한 외부대상>도 잘못 판단한다.
철수는 <철수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그런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객체)으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가 감각시 대하는 외부대상: (3^), (4^) 영희, 꽃, 산 등 ]
이는 <운동 동작>시도 마찬가지다.
<철수>가 손과 발로 <동작>을 취한다고 하자.
이 때 <철수가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그런 <동작의 외부 대상>(객체)으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가 운동시 대하는 외부대상: (3^), (4^) 영희, 꽃, 산 등]
그 외 이런 바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잘못> 행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감각해 얻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관련해 철수는 잘못 판단한다.
처음 철수가 <감관의 대상>을 잘못 판단한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철수가 눈을 떠 얻어낸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철수는 이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는 곧 <철수의 감관이 대한 대상>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철수는 <자신이 감각한 내용>이 <대상>에 대해 <옳은 내용>을 얻은 것으로 잘못 여긴다.
이는 <하나의 내용>에 철수가 <2개의 다른 지위>를 부여했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의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의 검토
철수는 다양한 판단을 행한다.
이런 판단을 1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그런 경우 이들 판단이 모두 잘못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정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철수가 얻은 내용> 전체를 방편상 <그림>에서 (5^)로 표시해보았다.
그런데 <철수가 얻는 내용>에 <철수 자신의 몸>이 들어가 있을 이치는 없다.
또 이 안에 <철수 밖 외부 세상>이 들어가 있을 이치도 없다.
<철수가 얻어낸 내용>은 한편, <다른 이>가 직접 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철수가 얻어낸 내용>은 여러 주체가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한편 이들 내용은 모두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따라서 이 안에 <철수의 감관>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또 <철수의 감관이 상대한> <외부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또한 이는 <철수가 동작을 취한> <외부 대상>도 아니다.
한편 이들 내용은 <철수가 얻은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감관이 상대한 외부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외부대상과 일치하는 내용>도 아니다.
그런 사정으로 이들 <감각현실>은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 철수>가 <또 다른 이>와 관련해 행하는 판단
철수가 <또 다른 주체 1>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자.
이 경우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우선 <다른 이 1>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가 보는 1: (1^)]
그리고 <그 나머지부분>을 역시 <1이 대하는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가 보는 <1의 외부세상>: (3^), (4^)]
또 이들 내용을 <철수 자신과 1이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한편 이 상황에서 1이 꽃을 만져 <촉감>을 얻는다고 하자.
이것을 철수가 밖에서 관찰한다.
그런 경우 철수는 <1의 감관>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
즉 철수는 <철수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1의 감관>이라고 여긴다.
[예: 철수가 보는 <1의 감관>: (1^)의 일부분 눈,코,귀,혀,손발 ]
또 <감관이 상대한 외부대상>도 잘못 판단한다.
철수는 <철수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1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 즉 객체로 잘못 여긴다.
[예: 철수가 보는 <1이 감각시 대하는 외부대상> : (3^), (4^) 영희, 꽃, 산 등 ]
이는 운동 동작시도 마찬가지다.
1이 손과 발로 동작을 취한다고 하자.
이 때 <철수가 얻어낸 내용> 일부분을 <1의 동작의 외부 대상> 즉 객체로 잘못 여긴다.[예: 철수가 보는 <1이 운동시 대하는 외부대상> : (3^), (4^) 영희, 꽃, 산 등 ]
한편 철수가 <다른 사람 1의 감각과정>을 관찰한다고 하자.
이 경우 <철수가 얻어낸 내용>을 <1의 감관이 대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예: 철수가 보는 <1이 감각시 대하는 외부대상> : (3^), (4^) 영희, 꽃, 산 등 ]
그런데 이 경우 <1이 개별적으로 얻는 내용>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상>과 <감각현실>이 일치한다고는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는 <하나의 내용>이 철수가 2개의 <다른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수는 <1이 얻어낸 내용>이 오직 <1 내부에서의 변화>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철수가 <1로 잘못 보는 부분>이 있다.
[예: (1^)]
그래서 <1이 얻는 내용>은 <철수가 1로 잘못 보는 부분> 안에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데 이 경우 <1이 눈을 떠 얻어낸 내용> 자체는 철수에게는 숨는다.
한편 이 경우 철수는 처음 <1이 대한 감관의 대상>을 잘못 판단한다.
그런 바탕에서도 철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게 된다.
즉 이 경우는 <1의 감관이 대하는 대상>과 <1이 그 대상에 대해 얻는 내용>이 분리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철수는 <다른 이의 감각과정>에 대해서는 <철수 자신의 경우>와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즉, 철수는 철수 자신의 경우에는 <철수 자신의 감관이 대하는 대상>과 <철수 자신이 그 대상에 대해 얻는 내용>은 서로 하나의 내용으로서 일치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분별은 잘못된 엉터리 <망상 분별>에 해당된다.
이런 <망상분별>을 제거해야 생사 고통과 생사묶임에서 벗어날 기초가 마련된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이 철수가 또 <다른 이와 관련해 행하는 판단>의 검토
다른 이 철수가 <1에 대해 행하는 판단>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잘못된 판단>이다.
이들 내용은 모두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안에 <다른 사람 1>이 들어가 있을 이치가 없다.
또 <철수가 얻은 내용>을 <다른 사람 1>이 대상으로 삼을 이치도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판단>들도 모두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철수가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이런 경우 철수는 이 내용 각 부분의 <성격>과 <지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는 그 각 부분이 갖지 않는 <성격>과 <지위>를 그 부분에 들어있다고 잘못 여긴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망상 분별>이다.
현실에서 이런 <망상분별>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생사 고통>과 <생사묶임>에서 벗어날 기초가 마련된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의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 검토
이제 1자신이 <외부 세상>에 대해 판단을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1자신도 <다른 사람 철수>와 같은 형태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철수의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에 준해서 <1자신이 행하는 판단>이 잘못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이 잘못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여긴다.
그리고 <외부의 대상> 및 <감관>으로 여긴다.
또 <동작의 대상>으로도 여긴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그 모두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그가 얻어낸 내용> 안에 <그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또 <그가 얻어낸 내용>에 <그 자신 밖 외부 세상>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을 <다른 이 철수>가 상대할 이치가 없다.
따라서 이는 철수 영희 등이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한편 이는 <그가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내용에 <이를 얻게 한 자신의 감관>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또 이런 내용에 <자신의 감관이 상대한 외부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그리고 이들은 역시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자신이 <이런 내용>을 대상으로 <동작>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런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들은 모두 결국 <잘못된 망상분별>과 관계된다.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이 가운데 <외부세상으로 여기는 어느 한 부분>을 취한다고 하자.
[예 (4!)]
그런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 표현>을 나열한다.
이 가운데 이를 <외부세상의 한 부분>, <외부대상>, <외부의 객관적 실재>, <외부 물질>로 이해한다고 하자.
이들은 모두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여기서 <감각현실>을 <넓은 의미의 '색'>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그런 경우 결국 다음처럼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 색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 색은 <자신>이 아니다.
- 색은 <외부 세상>이 아니다.
- 색은 영희나 철수 등 다른 이가 함께 대하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 색은 <한 주체의 감관>이 아니다.
- 색은 한 주체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 아니다.
- 색은 한 주체가 <동작시 대하는 외부 대상>이 아니다.
- 색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이는 <감관이 대한 외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색이 <대상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로 <옳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
한편, <마음>을 시설한 가운데 <색>을 살핀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다음 판단도 추가할 수 있다.
- 또한 색은 다른 <수상행식>과 마찬가지로 <정신이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따라서 <정신>과 구분되는 <물질>이 아니다.
- 또한 색은 다른 <수상행식>과 마찬가지로 <정신 안에 위치한 마음내용>이다.
따라서 <정신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물질>이 아니다.
다만 이는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의 <다른 이가 대하는 외부세상 등에 대한 판단> 검토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다른 이 철수> 등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철수가 대하는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여긴다.
그리고 이를 <철수의 감관>으로 여긴다.
또 철수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의 대상>으로 여긴다.
또 <철수의 손발> 등으로 여긴다.
그리고 철수가 손발로 하는 <동작의 대상>으로도 여긴다.
이처럼 자신은 <제 3자 철수>와 관련해 다양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이들 내용은 그 모두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그가 얻어낸 내용> 안에 '<다른 사람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또 <그가 얻어낸 내용>에 ≤철수 밖 외부 세상>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을 '<다른 사람 철수'>가 상대할 이치가 없다.
따라서 이는 철수 영희 등이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다른 사람 철수'의 감관>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리고 이 안에 '<다른 사람 철수'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다른 사람 철수'의 손과 발>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다른 사람 철수'의 손과 발이 동작시 대하는> <외부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다른 사람 철수'가 감각해 얻는 내용>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자신이 '다른 사람 철수'로 보는 부분>은 <다른 사람 철수>가 아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다른 사람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철수'>에 관해 이처럼 잘못 여기게 되는 것뿐이다.
여기서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을 <넓은 의미의 '색'>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그런 경우 결국 다음처럼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 색은 <다른 이 철수나 영희>도 아니다.
- 색은 <다른 이가 대하는 외부세상>도 아니다.
- 색은 다른 이가 대한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즉, <실재의 주체>나 <실재의 외부대상>이 아니다.
- 색은 <다른 주체의 감관>도 아니다.
- 색은 <다른 주체의 감관이 상대하는 외부대상>이 아니다.
- 색은 <다른 주체의 손발>과 같은 운동기관이 아니다.
- 색은 <다른 주체가 동작시 대하는 외부 대상>도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외부 세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의 제거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또는 <다른 이 철수> 등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외부세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외부 객관적 실재>, <외부 대상> 등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이런 <외부 세상> 등에 대한 이해가 모두 잘못이다.
평소 <한 주체>는 <자신>에 대해 가장 집착한다.
그런데 <이들 외부세상>도 <자신>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과 관련되는 정도>에 비례해 집착을 갖게 된다.
결국 이들 <외부 세상에 대해 갖는 집착>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 갖는 잘못된 판단>부터 시정해야 한다.
한편, 이런 잘못된 판단은 <자신과 세상의 올바른 정체> 파악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감각과정>이나 <운동과정>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도 문제된다.
한편, 이처럼 <외부 세상>을 잘못 판단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
그래서 이들 <잘못된 망상분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감각과정 및 동작시 <주관>과 <대상>의 인과 관계 문제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사과모습을 본다고 하자.
이 경우 <눈>을 감는다고 하자.
그러면 사과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눈>을 뜬다고 하자.
그러면 <사과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한편 이 상황에서 사과를두드리며 <귀>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소리>를 듣게 된다.
한편, <코>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과 향기>를 맡게 된다.
한편 <혀>를 댄다고 하자.
그러면 <사과 맛>을 보게 된다.
한편, <손>을 댄다고 하자.
그러면 <사과의 촉감>⁸을 느끼게 된다.
현실에서 <이런 관계>를 반복해 경험한다.
이 경우 <자신이 눈으로 본 내용>안에< 이들 각 부분>이 있다.
[사과, 귀,코, 혀,손 . . . ]
이 경우 <이들 각부분>은 각각 <대상>과 <주관>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그런데 이들 각 부분은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한 주체의 감관>이나 <대상>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들 각부분은 <실재의 대상>과 <감관>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이미 살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은 서로 상충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입장>이 옳은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눈>을 뜬다.
이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들 내용은 <눈>을 떠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 가운데 <눈>을 통해 <사과>를 <손>으로 만지며, <그 만지는 모습>을 본다고 하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는 <촉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본 '사과 ' 모습>이 곧 <촉감을 얻게 한 외부대상>이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눈으로 본 '손'의 모습>이 곧 <촉감을 얻게 한 감관>이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경우 <그런 모습>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시각내용>이다.
[색깔감각]
그런데 <이런 시각 내용>이 <청각이나 촉각 감각내용 등을 일으키는> <대상>과 <감관>은 아니다.
<눈>으로 <사과를 만지는 모습>을 본다고 하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손>으로 <촉감>을 별개로 얻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동시 부대상황 관계>에 해당한다.
그런 가운데 이 <각 내용>을 결합시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눈으로 본 모습>이 <촉각을 얻게 한 대상>이 아님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상황에서 <눈>을 감으면 이 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눈>을 감는다고 하자.
그러면 <사과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래도 <손으로 만져 얻는 촉감>은 그대로 얻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눈으로 본 모습>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 없이, <촉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각정보는 <촉각을 얻는 대상이나 감관>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눈으로 얻는 시각정보 >와 <다른 감각 과정>을 살핀다고 하자.
이 경우 <다음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이런 <시각 정보>는 결국 <감각을 얻게 하는 감관이나 대상 >이 아니다. -
한편 이 상황을 반대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자.
<손>을 만져 얻는 <촉감>이 있다.
이런 <촉감 부분>을 <눈>이 대하여 <색깔 감각>을 얻는다고 이해한다고 하자.
<이런 이해>는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촉감>이, <시각이나, 청각, 후각, 미각 정보> 등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다른 감각내용>들 간의 관계도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다.
즉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정보>와 <각 감각작용>의 관계가 이와 같다.
이들 <감각현실>은 <감각기관>이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떠 보는 과정을 살펴보자.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하게 된다.
한편 <눈>을 뜰 때는 <눈의 동작에 대한 촉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들 <촉감내용>과 <시각 감각 과정>을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들 촉감 내용>이 <시각 정보를 얻는 대상과 감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눈>을 뜬다.
이런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들은 한 주체가 <감각과정을 통해 얻은 내용>이다.
이들 내용에 <그런 감각을 얻게 한 감관과 대상>이 있을 이치는 없다.
이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살핀 내용>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촉각 정보>에 <촉각을 얻게 한 감관이나 대상>이 있을 이치는 없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Table of Contents
▣- 현실에서 운동의 인과관계
현실에서 <운동 동작 과정>을 눈을 뜨고 바라본다고 하자.
그러면 <각 부분>이 서로 <작용>하고 <힘>과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겨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돌>을 주어 <병>을 향해 던진다고 하자.
이 경우 <손>을 뻗쳐 <돌>을 줍는다.
그리고 던지게 된다.
그러면 그 <돌>이 날아간다.
이 경우 자신이 <눈으로 본 돌>과 <손>이 있다.
여기서 <눈으로 본 손> 부분은 <동작을 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그리고 <눈으로 본 돌> 부분은 이러한 <동작이 행해진 대상>인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그래서 이 경우 이런 각 부분이 <운동기관이나 대상>인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 안에 <자신의 몸>이나 <외부 대상>이 들어있을 이치는 없다.
이는 눈을 통해 얻은 시각적 <감각현실>이다.
이 경우 <시각정보의 한 부분>이 <시각 정보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자신이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자신>이나 <자신의 운동기관>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돌>을 던진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눈>을 감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도 <돌>은 날라간다.
이 상황에서 눈으로 <그런 모습>을 얻지 못해도 <그런 사실>은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감각현실> 각 부분은 서로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상황에서 <눈으로 본 내용>을 빼거나 넣거나 관계없이 <돌>은 날라간다.
그래서 <눈으로 본 모습>들은 <돌이 날라감>에 대한 원인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각정보>는 그런 <동작을 행한 운동기관이나 대상>이 아니다.
한편 <다른 감각내용>의 경우도 사정이 같다. [색ㆍ성ㆍ향ㆍ미ㆍ촉]
즉, <눈으로 본 모습> 외에 <다른 감각 내용들>도 사정이 같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본 모습>은 <운동 기관이나 대상>이 아님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촉감 내용>이나 <다른 감각현실>이 <운동기관이나 대상>이라고 잘못 이해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위 상황에서 눈을 감고 손으로 돌을 만질 때 <촉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런 <촉감>이 <운동기관이나 대상>은 아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얻거나 못 얻거나 관계없이 위 현상은 나타난다
현실에서 <운동 기관이나 대상이라고 여기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들 부분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즉, <이들 감각현실>은 그런 <동작을 행한 운동기관이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생사현실 안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내용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즉 그런 <감각현실 각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나 <지위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 객관적 <실재>에 대한 흔동
예를 들어 <돌>을 <손>으로 굴린다고 하자.
이 순간 자신이 <눈>을 감는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돌>이나 <손>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이미 많이 반복 경험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본 <돌>이나 <손>을 막연히 관념 형태로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눈>을 감아 보지 못해도 이들 내용은 여전히 그 상황에 그대로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막연히 추리하게 된다
그런 경우 <자신이 그 직전에 보았던 모습>을 <객관적 실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런 <잘못된 추리>는 다음 <일상생활 경험>에 의해서 지지받기 쉽다.
즉 눈을 감은 가운데, 옆에 있는 영희나 철수에게 다음처럼 묻는다고 하자.
나는 눈을 감아 <돌>이나 <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희, 철수 너희들은 그런 <돌>이나 <손>이 보이는지,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영희나 철수는 그것이 여전히 그대로 보인다고 보고하게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추리가 옳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희나 철수가 답하는 내용의 <성격>이다.
영희나 철수가 눈으로 <돌 모습>을 본다고 하자.
이 경우 영희가 철수는 자신이 이전에 얻었던 <감각 현실>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영희나 철수가 제각기 주관적으로 얻어낸 <감각 현실>을 가리킨다.
그래서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반대로 자신이 눈을 떠 <돌 모습>을 본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자신은 <영희나 철수가 얻어낸 감각 현실>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제각기 주관적으로 얻어낸 <감각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감각현실>은 모든 이가 함께 대하는 <객관적 외부실재>가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판단>을 일반적으로 행하기 쉽다.
한편 각 주체가 눈을 뜨고 감음과 관계없이 그대로 있다고 할 <실재>를 찾는다고 하자.
여기서 문제삼을 <실재>는 각 주체와의 관계를 떠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이 경우 그런 <실재>는 현실에서 얻은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추리하기 쉽다. [설일체유부]
또는 현실 내용과 <유사하거나 비례>하는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추리하기도 한다[경량부]
또는 극단적으로 마음 밖의 실재 영역에는 아무것도 <전혀 없다>고 추리하기도 한다.[세친 이후 후기 유식학파]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
문제 삼는 <실재>를 각 주체는 끝내 얻지 못한다.
각 주체는 자신이 관계해 얻어내는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재영역>에 어떤 내용이 그처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실재영역>에는 아무 것도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얻지 못함>과 <전혀 없음>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재>는 <있고 없음> <같고 다름> 등의 모든 2 분법상의 분별을 떠난다.
또한 <실재>는 일체 언설을 떠난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으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일반적인 입장에서 실재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별 의미를 갖지 않는 공(空)이란 표현을 빌려 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실재는 공(空)하다고 방편상 표현하게 된다.
즉 공(空)이란 표현은 이런 사정을 나타내기 위한 가명(假名)이고 시설(施設) 방편(方便)이다.
- 현실경험과의 차이
현실에서 <운동 기관이나 대상>으로 <여기고 가리키는 각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뜨면 <일정한 내용>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자신의 손>이나 <돌>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운동 기관이나 대상>이라고 여기고 가리키게 된다.
그런데 이들 부분은 <운동기관이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음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하자.
이런 각 부분은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 안에 <자신의 운동 기관>이나 <외부대상>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그래서 이들 감각현실의 각 부분은 <실재의 운동 기관이나 대상>이 아니다.
한편 각 주체는 <본 바탕 실재>를 얻지 못한다.
각 주체는 자신이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본바탕 실재 영역에서 <실재의 운동 기관과 대상>는 끝내 직접 얻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의 운동 기관과 대상>는 <공하다>고 언설로 표현하게 된다.
사정은 그렇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하자.
그렇다해도 현실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 안에서는 다음 내용을 반복해 경험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뜨면 일정한 내용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자신의 손>이나 <돌>로 여기게 된다.
그런 가운데 <돌>을 주어 던지려는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눈으로 보이는 돌>을 던지려는 <뜻>을 일으킨다. [의업(意業)]
그리고 <동작>을 행한다.[신업(身業)]
그러면 이로부터 예상하는 일정한 결과를 얻게 된다.
즉 <눈으로 보이는 돌>이 날라가는 모습을 이어 보게 된다.
일상생활이 모두 이와 같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배가 고파 음식을 먹는 경우도 이와 같다.
이런 경우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눈으로 보이는 수저>를 잡으려 <뜻>을 일으킨다.
그리고 <동작>을 행한다.
또 그렇게 하면 배가 부르게 된다.
현실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를 반복해 경험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일반의 경우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할 도리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런 <현실 경험>을 토대로 이해한다고 하자.
이런 현실 경험은 <그 각 부분>들이 <운동 기관과 대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감각현실의 일정 부분>을 <운동기관이나 대상>이라고 <여기고 가리키게> 된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은 서로 상충한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떤 입장이 옳은 판단인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배경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추가로 요구된다
현실경험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이해할 내용은 다음이다.
- 현실경험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사정
-- 자신의 동작과 관련되는 외부현상
현실에는 자신이 관련되어 외부에 동작이나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돌>을 던져 그 <돌>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와 같다.
이런 경우는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눈>을 통해 <자신으로 여기고 가리키는 부분>은 사실은 <자신의 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움직이려고 <뜻>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러면 <근본정신>과 관련된 기제를 바탕으로 <운동 동작>을 행한다.
각 주체는 처음 생을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의 몸으로 삼는다.[구생기신견(具生起身見)]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이후 각 감관 및 운동기관 등과 정신을 분화 생성시킨다.
그런 바탕에서 이후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후 감관으로 감각하고 <뜻>을 일으켜 <업>을 행해 나간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다시 <그 결과 내용>을 감관을 통해 감각하고 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하는 <몸 부분>과 <외부 세상>을 감각하고 대하게 된다.
그리고 <얻은 감각현실 부분> 가운데 <평소 자신으로 여기고 가리키는 부분>을 바로 움직인 것처럼 잘못 여기게 된다.
또 <평소 외부 세상이나 대상으로 여기고 가리키는 부분>을 바로 붙잡아 움직인 것처럼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운동 동작>은 <그런 감각현실>을 직접 변화시키거나 붙잡은 것은 아니다.
다만 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내용>을 눈을 통해 그처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여기게 되는 것뿐이다.
이 경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외부실재 영역>과의 관련성을 추리해야 할 것이다.
( 본바탕 실재 ) → 감각 → 관념 분별 → 의지, 의업意業 → 운동 동작, 신업身業→ ( 본바탕 실재 ) → 감각
다만 이 경우 <외부 실재>의 관련성은 추리될 뿐, 그 실재 내용을 직접 얻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재 영역>에서 직접 <주체>와 <대상>의 내용을 얻어내 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 안에서 분별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오직 감각현실[의타기상(依他起相)] 각 부분의 관계만 제시하게 된다.
이것이 <세속>에서 제시하는 <인과관계>의 내용이 된다. [세제(世諦)]
<실재 내용>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내용을 <인과 요소>나 <주체>나 <대상>으로 제시할 도리는 없기 때문이다
-- 자신의 동작과 관련되지 않는 외부현상
한편 현실에서 <자신의 동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외부현상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매일 <달>이 반복해 뜨는 경우와 같다.
그리고 이런 현실 내용은 <다수>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한 <관계>로 반복 경험하게 된다.
이런 사정으로 이들 내용은 꿈과 달리 <실다운> <외부 세상>이나 <외부 대상>으로 잘못 여겨지게 된다.
또 이들 각 부분이 서로 <작용>하고 <관계>맺는 것처럼 잘못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감각 현실>이다.
이들은 <외부세상>이나 <외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다음 사실을 추가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각 주체가 이런 현상을 이런 형태로 얻게 되는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 사정은 <외부실재 내용>을 <각 식(識)>이 일정하게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한 주체의 <감관>이나 <마음의 상태>는 비교적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데 <감각현실>의 각 부분에서는 각기 다른 특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눈을 뜨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내용 가운데 평소 <자신 - 동류 인간- 다른 생명체 - 무생물>으로 여기는 각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눈으로 얻어낸 <마음내용>인 점에서는 <공통>하다.
그러나 이들 각 부분은 현실 경험상 각기 다른 특성이 발견된다.
즉 <감각현실> 안에서 각 부분간에 차별적인 내용과 특성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나타나는 사정은 <마음 밖>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그런 가운데 <동류인 생명체>들은 <감관의 상태>가 엇비슷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나 영희, 철수는 <인간>으로서 서로 상태가 엇비슷하다.
마찬가지로 <개미>는 개미대로, <양, 소, 박쥐> 등은 그들대로 서로 상태가 엇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각 주체는 각기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현실내용은 <다수>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한 <관계>로 반복 경험한다.
현실 생활과 상호 교류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되는 사정은 한 주체의 마음에서만 원인을 찾기는 곤란하다.
한 주체만의 특수한 사정을 다른 주체들이 함께 얻는다고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각 주체가 함께 대하는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 주체의 마음 밖 영역인 <실재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된다.
다만 그러한 <외부 실재>의 차별은 추리될 뿐, 그 내용을 직접 얻지는 못한다.
그리고 <실재 영역>에서 <대상>및 <주체>의 내용을 직접 얻어내 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재 영역>에서 <구체적 원인 요소>를 얻어내 제시할 수는 없다.
한편 <후기 유식학파> 일부에서는 다른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선 이들은 마음 밖 <실재 영역>에는 아무것도 전혀 없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사정을 <각 주체의 근본정신>의 자체적 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각 주체의 근본정신>(아뢰야식)에 저장된 종자(種子)로 인해 얻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예: 관소연연론]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난점이 많다.
우선 <후기 유식학자> 입장처럼 <실재 영역에는 아무것도 전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마음 밖 실재내용>은 각 주체가 얻지 못한다.
그래서 공하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는 <유무 분별>을 떠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재영역에 <아무 것도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생사현실 내용은 <다수>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한 관계>로 반복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떤 이가 길 가에 <집>을 짓는다고 하자.
이 경우 이후로는 길을 지나가는 다른 이들도 다 함께 이 <집>을 보고 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차별상을 <각 주체의 근본정신> 내 <종자>의 사정만으로 설명함은 지나치다. [공종자(共種子)]
이 경우 어떤 이가 <집>을 짓는 일이 그 주체의 <종자>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런 일로 한 주체의 <종자>가 변화된다고 하자.
그렇다고 이로 인해 <다른 주체들의 근본 정신내 종자>도 모두 변화된다고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또 한 주체가 <다른 주체의 근본 정신내 종자>를 대상으로 감각한다고 하는 것도 곤란하다.
- 실재의 공함과 현실의 실답지 않음
한편 <실재의 공함>을 바탕으로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제시한다.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사정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꿈>을 실답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꿈 밖 영역>에 <전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꿈 밖 영역>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내용>으로 있음을 의미함도 아니다.
단지 <꿈 내용>과 <꿈 밖 영역 내용>이 서로 엉뚱하게 동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꿈 내용>은 바다인데, <꿈밖>은 <침대와 가구가 있는 방>처럼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
현실이 <실답지 않음>도 이와 사정이 같다.
현실은 매순간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는다.
그러나 본 바탕이 되는 <실재>는 그 내용을 얻지 못해 공하다.
그래서 현실은 <이런 본바탕 실재>와 대비해 꿈처럼 <실답지 않다>고 하는 것 뿐이다.
이 경우 <마음밖 실재>를 전혀 없다고 해야만, 현실이 실답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실재가 공함>은 마음 밖에 <전혀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실재는 <차별없이 공하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실재가 <차별없이 공함>은 단지 일체에 대해 <그 실재>를 각 주체가 <다 함께 직접 얻을 수 없음>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는 실재 영역에서 <어떤 성품을 얻고 그리고 그 성품이 하나로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실재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내용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공함은 <같고 다름>의 분별을 떠난다.
- 수행에서 2측면의 효용
현실에서 <눈>을 뜨면 <일정한 내용>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자신의 손>이나 <돌>로 여기게 된다.
이처럼 현실에서 <운동 기관이나 대상>으로 <여기고 가리키는 각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실 경험은 <그 각 부분>들이 <운동 기관과 대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 각 부분은 <실재의 운동 기관이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실재의 운동 기관과 대상>는 <공하다>고 언설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은 표면상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정체는 살필 때는 먼저 현실에 참된 <실체>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실체>는 현실을 나타나게 하는 뼈대가 되는 참된 내용을 가리킨다.
즉 <실체>는, <꿈>과 달리, 실답다고 할 참된 내용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내용이 꿈과 성격이 같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그것을 실답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체>는 <꿈처럼 일정 조건에 의존해서만 얻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실체>는 꿈과 달리,<고정>되고 <영원 불변한 참된 내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현실 내용은 그런 <실체>를 과연 갖고 있는가가 문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본바탕 실재>가 무엇인가가 문제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참된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 <실재>가 <공>하다고도 할 수 없다.
또 그런 경우에는 생사현실에서 각 주체가 화합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얻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한편<본 바탕 실재>는 그런 실체가 없는 가운데. 그 내용을 얻지 못한다.
각 주체는 오직 <그 주체가 관계한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하게 된다. [무아. 무자성, 불가득.공]
그래서 <실재가 공함>은 <고정 불변된 실체가 없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된다.
또 <본 바탕 실재>의 사정이 그런 까닭에 이런 <생사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반대로 생사현실에서 각 주체의 마음이 화합해 현실내용을 얻어내는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하자.
그리고 <현실의 정체>와 현실 내용이 나타나는 <연기(縁起)> 인과관계를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통해 <본바탕 실재 영역>에 <참된 실체가 없음>과 , <본 바탕 실재가 공함>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의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각 측면>을 수행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각 부분의 내용들이 수행에서 갖는 효용이 있다.
우선 수행에는 <성문승과 벽지불승> 그리고 <보살승>처럼 각기 다른 방향이 있다.
이에 따라 수행의 초점이 달라지게 된다.
- 무여열반을 향한 수행
수행에는 우선 <성문승과 벽지불승>의 수행이 있다.
이는 <생사고통>과 <생사윤회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생사해탈과 회신멸지(灰身滅智)의 무여열반(無餘涅槃)을 목표로 수행을 하게 된다.
이는 비유하면 환자가 병을 낳아 병원을 퇴원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다.
이를 위해 수행자는 <망집 번뇌>와 <집착>을 제거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무상(無常)하고, 고통이며, 무아(無我) 공(空)임을 관한다.
이 경우 생사현실의 본바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은 다음 효용을 갖는다.
우선 이를 통해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얻은 내용>이 사실은 <자신>이나 <외부세상>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얻은 내용>이 <자신의 운동기관>이나 <외부 대상>이 아님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결국 <3계 생사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게 해준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묶임>을 벗어나는 수행에 도움을 주게 된다.
-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
한편 수행에는 <대승 보살의 수행>도 있다.
이는 다음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다.
수행자는 우선 자신부터 <생사 고통>과 <생사 윤회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른 중생>도 <생사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함을 목표로 수행을 하게 된다.
이는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이가 자신의 병도 치유한다.
그런데 그 뿐 아니라 장차 의사가 되어 <다른 환자>를 치유하려는 경우와 같다.
<생사현실에 처한 중생>은 혼자 자신의 힘으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일반인은 <잘못된 망집>에 바탕해서 임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는다 .
그러나 이런 <생사>와 <고통>은 본래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망집>을 일으켜 그런 <생사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깨달음(보리)에 의해 이런 사정을 관(觀)한다.
그리고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생을 <생사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제도>하려는 서원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아야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보살 수행자는 우선 <생사현실>의 본바탕이 <공함>을 잘 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겪는 <생사 고통>을 평안히 참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고 <생사현실>에 임할수 있게 된다.
그런 가운데 <상사현실> 안에서 <중생 제도>를 위한 수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하여 <중생제도>를 해 나가게 된다.
대승보살 수행자는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러면서도,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이는 <성문 수행자>와는 다른 측면이다.
<성문 수행자>는 <생사 묶임>를 완전히 벗어나 <무여열반>을 목표로 한다.
이런 사정으로 <대승 보살 수행자>는 <공한 실재>와 <생사현실> 두 측면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한다.
그래서 <공한 실재>의 측면에서는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마치 <니르바나>의 상태처럼 임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여여하게 <생사고통>과 <생사 묶임>을 벗어나 임하려 한다.
한편 <생사현실> 측면에서는 수행자는 <인과>를 관한다.
그리고 <무량한 선법>을 닦아 나간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보살승 수행자>는 먼저 현실안에서 다음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생사현실 내용>은 우선 크게 <감각 현실>과 <관념>이 있다. [의타기상과 변계소집상]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외부대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수행자는 우선 <그런 각 부분>은 사실은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관념내용>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자.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금 <영희>가 어디 있는가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얻어낸 감각 현실>의 <일정 부분>을 <영희>라고 여기며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이는 <자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자신이 <얻어낸 감각 현실>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며 가리키게 된다
그런데 이는 <망상 분별>에 바탕해 현실 안에서 <상(相)>을 취하고 임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보살승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이런 <망집>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상(相)>을 취하고 임하지 않아야 한다. [무상삼매해탈]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 고통>을 당면할 때 평안이 참고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안인(安忍)]
스스로 <자신>이나 <외부세상> 등으로 <여기며 대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상>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안인 수행>을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생사 현실>을 피하여 <성문승>의 상태로 물러나지 않게 된다. [ 불퇴전 (不退轉)]
한편 <현실에서 얻는 각 내용>들은 모두 <한 주체가 얻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들 현실내용은 <실재의 주체>나 <외부 세상>의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 현실 내용을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들 현실내용은 <실재의 운동 기관이나 대상>도 아니다.
한편 이들 현실내용은 <마음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마음을 떠나 따로 있는 <외부 물질>도 아니다.
이런 사정을 먼저 기본적으로 잘 이해해야 된다.
한편 자신과의 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내용>을 찾는다고 하자.
그러나 각 주체는 본바탕 <실재의 내용>을 끝내 얻을수 없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한다.
한편 이런 사정으로 본바탕인 실재는 <현실내용과 일치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는 현실 내용과 <유사하거나 비례하는 내용>이라고도 단정할 수없다.
또한 실재가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할 도리도 없다.
그런 가운데 본바탕 실재에서는 현실에서 문제 삼는 <생사>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는 <생사> <생멸>을 얻을 수 없는 <본래 청정한 열반> 상태다. [자성청정열반]
그리고 <현실 내용>을 이런 <공한 실재>와 대조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 내용은 마치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또 한편 <현실의 내용>은 이런 <공한 실재>를 따로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은 곧 열반과 다르지 않음>을 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정>의 이해는 <망집>을 기본적으로 제거해 주게 된다.
따라서 <보살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망상분별>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각 주체는 현실에서 일정한 <현실내용>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들 현실 <내용>은 생사현실에서 <연기(緣起)>에 따라 나타난다.
따라서 수행자는 <공한 실재>와 함께 <연기에 따라 나타나는 현실>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생사현실>에서 올바로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행하던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계-정-혜 수행>을 올바로 닦아 나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현실에서 <생사 고통>을 <예방>한다.
또한 이런 수행은 불가피하게 <생사 고통>에 당면할 때도 이를 완화 제거해 주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 가운데 수행자는 생사현실 안에서 <무량한 선법>을 닦아 나간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그래서 수행자는 <생사현실 측면>과 <본바탕인 실재의 측면>을 모두 함께 잘 이해해야 한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는 <보살 수행의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이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아상(我相)ㆍ인상(人相-보특가라상)ㆍ중생상(衆生相)ㆍ수자상(壽者相)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상(相)에 머물지 않아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복덕(福德)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
{ K0013V05P0979b02L;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實無衆生...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요진 구마라집역(姚秦 鳩摩羅什譯), K0013, T0235 }
이 경전에서 <보살 수행자>는 무량하게 <중생>을 제도함을 제시한다.
이는 보살 수행자가 <생사현실 측면>에서 닦아나갈 수행을 제시한 것이다.
즉 보살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들어가 중생제도의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전에서 <제도 받은 이>가 없다고 제시한다.
이는 <실상의 측면>에서 수행자가 <망상 분별>과 <집착>을 제거하고 그런 수행을 해나가야 함을 제시한다.
본래 생사현실 안에서 얻는 <현실내용> 일체는 하나같이 <참된 실체>가 아니다. [무아, 무자성]
즉 <꿈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생사현실 내용> 일체는 <자신>이 관계하여 화합해 얻어내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바탕 <실재 영역>에서는 그런 현실 내용을 얻을 수도 없다. [불가득 공]
이런 측면에서 <현실 내용>을 실답다고 여기며 대하는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공삼매해탈]
또한 생사현실에서 <얻는 현실내용>에서도 다시 <감각현실>의 영역과 <관념>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계분별관]
그래서 <관념 분별>을 바탕으로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을 취해 그런 내용이라고 여기고 대하면 곤란하다. [무상삼매해탈]
보살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망집>을 떠나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을 <제도>하되 <상>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현실에서 <무상삼매>를 통해 <망상 분별>을 제거하는 측면이다.
이처럼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는 <보샬 수행자>가 <생사현실>에서 취할 <수행의 기본 자세>를 제시한다.
그런데 혹자는 다음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경전에 제시된 것처럼 정말 <제도 되는 이>가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도 처음부터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수행자가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제도 되는 이>는 생사현실에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행자가 중생을 제도 함>과 <제도되는 이가 없다>는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재의 측면>과 <생사현실의 측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영희>나 <철수>로 여기며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가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내용>이 아니다.
단지 그가 그런 <감각현실>을 얻고나서 <그런 관념>을 일으킨 것 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을 취해 <그런 영희나 철수>라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영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감각현실 일정부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부분에 <영희>가 <있다>고 말하게 된다.
또 그런 <감각현실 일정부분>이 곧 <영희><이다>라고 여기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망상분별>에 바탕해 <상을 취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런 <망상분별>을 떠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각 부분이 <그런 관념내용>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각 주체는 <망집>을 일으켜 임한다.
그래서 <그런 감각현실 각 부분>을 <자신>이나 <영희> <철수> 등으로 여기면서 임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런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어나간다.
현실에서 중생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현실 내용>에는 꿈과 달리 <참된 실체>가 있다고도 여기기도 한다.
또는 현실 내용이 곧 <객관적 실재>라고 잘못 여기기도 한다.
또는 <본바탕 실재>는 <현실 내용과 일치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서 일으킨 <잘못된 망상 분별 내용>을 <실다운 내용>으로 잘못 여기게 한다.
그리고 현실 내용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이런 망집에 의해 <업>을 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생사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이 경우 그러한 <망집>은 잘못된 내용이다.
망상분별로 <각 주체가 있다고 여기는 내용>은 사실은 현실에서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작 그런 <망집>은 생사현실 안의 문제상황을 만든다.
즉 <각 주체>는 그런 <망집>으로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고통>을 생생하게 겪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즉 망상분별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리고 망상분별로 <각 주체가 있다고 여기는 내용>은 없다.
사정이 그렇다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잘못되고 없는 내용>이지만, 그로 인해 각 주체가 <문제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이는 <엉터리 보물지도>가 일으키는 문제와 같다.
<엉터리 보물지도>의 내용은 <엉터리>다.
그런 보물은 현실에 없다.
그런데 <엉터리 보물지도>를 믿는 이는 이를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에 바탕해 공연히 엉뚱하게 <땅>을 파기도 한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엉터리 보물지도>의 내용은 <엉터리 내용>이다. .
그런 보물도 현실에 없다.
그런데 <엉터리 보물지도>의 내용은 <엉터리>다.
그런 보물은 현실에 없다.
그런데도 <엉터리 지도>와 <없는 보물>로 <고통받는 현상>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엉터리>이고 <본래 없는 내용>이라고 그대로 방치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현실에서 <영희>나 <철수>로 <여기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각 부분>은 사실 참된 <영희>나 <철수>는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는 <각 주체>가 그 배후에 있다.
즉 <그런 부분>마다 그 부분을 스스로 자신으로 여기고 임하는 영희나 철수가 있다.
이는 그 <배경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즉 각 주체는 <각 주체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처음 생사 현실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가 처음 <생사현실>에 그렇게 임하게 되는 <배경 사정>까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수행자가 이런 중생을 <생사묶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함께 들어가 이들 중생을 대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처럼 생사현실 안에 <본래는 없다고 할 내용>을 함께 취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해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
즉 현실 내용의 <각 부분>은 사실 참된 <영희>나 <철수>는 아니다.
그리고 현실 내용의 <각 부분>에 <영희>나 <철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각 주체>의 <망집을 일으킨 근본정신>이 그 배후에 있다.
그래서 수행자도 생사현실 안에 함께 그처럼 임해 중생 제도를 해 나가게 된다.
한편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사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보살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이 <두 측면>을 함께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실재>와 <현실> 두 측면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모두 함께 올바로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
즉 <공한 실재의 측면>에서 망집과 생사고통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의 측면>에서 무량한 선법을 닦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임해야 <생사현실> 안에서의 <수행>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된다.
지금까지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운동 <기관>과 <대상>으로 여기는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살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감각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즉 감각과정에서도 <감관과 대상>에 대해 이런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이는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이 객관적 실재가 아닌 사정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돌>을 병을 향해 굴린다.
이 경우 옆에 <철수>나 <영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철수나 영희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언어로 보고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신과 영희, 철수가 모두 함께 대하는 객관적 실재>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모두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한 주체>는 <다른 주체가 얻는 감각현실>을 직접 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른 주체>가 대할 이치가 없다.
따라서 <감각현실>은 <영희나 철수가 함께 대하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은 서로 상충한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떤 입장이 옳은 판단인지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이 경우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떤 조각상>을 함께 구경한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자신이 <눈>을 감는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도 다른 <영희>나 <철수>는 여전히 일정한 모습을 본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자신이 본 내용>을 <다른 이>가 <대상>으로 삼아 보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때 <자신>은 <정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영희>와 <철수>는 각기 <옆>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각기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한다고 하자 .
그러면 이들이 제각각 달리 <감각현실>을 얻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얻는 내용>은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이 다수에게 일정한 관계로 반복 파악되는 사정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좁은 의미의 색]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들을 <영희>나 <철수>와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여긴다.
또한 이들을 <자신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으로 여긴다.
또한 이들을 자신의 <동작>시 대하는 <외부 대상>으로도 여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이런 성격의 내용들>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판단>이다.
한편 <감각현실>(색ㆍ성ㆍ향ㆍ미ㆍ촉) 일체를 <넓은 의미의 색 >이라고 칭한다.
이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 색은 <자신>이 아니다.
- 색은 또한 영희나 철수 등<다른 주체>도 아니다.
- 색은 <외부 세상>이 아니다.
- 색은 영희나 철수 등 <다른 이와 함께 대하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 색은 <한 주체의 감관>이 아니다.
- 색은 <한 주체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 아니다.
- 색은 <한 주체가 동작시 대하는 외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들 각 부분>은 오히려 <자신>이나 <영희> <철수>인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그리고 또 이들이 <외부 세상인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은 영희나 철수가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인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그리고 또 이들 각 부분이 <대상>과 <감관>인 것처럼 잘못 여겨진다.
또 동작시 동작이 미치는 <동작의 대상>으로도 잘못 여겨진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들 <각 부분> 간에 일정한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래서 <사과>를 만지는 모습을 본다고 하자.
그러면 그 때마다 손에서 <촉감>을 얻게 된다.
이처럼 <시각내용>과 <다른 감각내용> 간에 일정한 <관계성>을 파악하게 된다. [감각간의 관계]
한편 <손>으로 <돌>을 붙잡는다. 그리고 굴린다.
그러면 굴러가서 <병>을 쓰러뜨린다.
이들은 모두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각 부분> 간에 일정한 <관계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운동관계]
한편 자신이 <사과>를 집어 <철수>에게 건넨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도 <촉감>을 느낀다.
그리고 철수도 <촉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를 서로 <언어>로 보고한다.
이를 검토한다고 하자.
그래서 <감각현실>은, <다수>에게, 일정한 <시기> <장소> <조건>에서, 엇비슷하게 <반복>해 얻어진다고 보게된다. [다수가 함께 얻음]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이런 <관계성>이 파악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현실을 실답게 여기게 되는 사정>을 살필 때 살폈다.
(참고 ▣- 다수가 일정 내용을 반복 경험하기에 그 실재가 있다고 여김)
이는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감각현실>은 한 주체가 <개별적으로 얻어낸 내용>이다.
그럼에도 현실 경험상, <다수 주체>가 <엇비슷한 감각내용>을 반복해 얻게 된다고 보게 된다..
그래서 <그 배경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각현실>은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따라서 오직< 이 사정>만을 강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감각현실>이 <다른 주체>에게도 엇비슷하게 얻어지는 사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또는 오로지 <한 주체의 마음 영역>에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자. [예: 제8아뢰야식내 공종자]
그런 경우 역시 엇비슷한 <감각현실>을 <철수>나 <영희> 등도 함께 얻는 사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한 주체는 <다른 주체의 마음안 내용>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감각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정의 이해를 위해 <마음 밖 본바탕 실재>가 무언가를 추리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영역에 <외부 실재 대상>을 막연히 추리해 시설한다.
한편, 각기 <다른 감각내용> 간에 일정한 관계성이 현실에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사과를 만지며 <그 모습>을 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손에서 <촉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 사이에 매번 이런 <관련성>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관계성>은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그 배경으로 보아야 한다.
처음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임한다.
그래서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처음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후 이런 바탕에서 <각 감관> 등이 분화 생성된다.
그런 상태에서 현실에서 이들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러면 각 종류의 <감각현실> 각 부분이 서로 마치 관계하는 것처럼 파악된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모습을 보는 상황에서, 촉감 등 <다른 감각들>을 함께 얻는 것뿐이다.
즉 이들 각 내용은 서로 간에 <동시 병행(竝行) 부대(附帶)상황>의 관계다.
그리고 이를 후발적으로 서로 관련시켜 이해하게 된다.
한편 <감각과정에서 대상>은 <실재영역>에 일단 시설해야 한다.
<운동과정>에서의 상호간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이와 사정이 같다.
현실에서 <돌>을 본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눈으로 본 돌 모습>에 해당한 무언가가 막연히 <실재 영역>에 있다고 시설 해본다.
그리고 그런 <실재 영역의 무언가>에 바탕해 <그런 모습>을 시각으로 얻는다고 추리한다.
한편 그 상황에서 다른 <청각,후각,미각,촉각>도 함께 병행해 얻어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후 후발적으로 서로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으로 <돌>을 붙잡는다. 그리고 던진다.
그러면 날라가서 <병>에 맞는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실재 영역>에 <막연히 일정한 내용>을 시설한다.
그 상태에서 <시각>으로 <돌>이 굴러가는 모습을 본다.
또 이 상황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소리>를 <청각>으로 <동시 병행>해 얻는 관계다.
한편, <감각현실>을 <다수 주체>가 함께 엇비슷하게 얻는다.
이런 경우도 <실재영역>에 <막연히 일정한 대상>을 있다고 일단 시설한다.
그런데 <각 주체의 감관> 등의 상태가 엇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실재 대상>을 <각 주체>가 <엇비슷한 관계>로 대한다.
그래서 <각 주체>는 <엇비슷한 내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실재 영역의 외부 대상>을 #으로 막연히 표시해보자.
그리고 이를 대하는 <각 주체의 마음>을 A로 표시하자.
그리고 <그 주체가 얻어내는 내용>을 C로 표시하자.
이런 경우 각 주체가 <실재대상>을 대한다.
그리고 제각각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관계는 다음이다.
# + a => C
그런데 <각 주체>에서 <이 관계>가 서로 엇비슷하다.
그런 사정으로 <각 주체>가 <서로 엇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얻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 식에서는 <본바탕 실재 대상>을 막연히 기호 #로 표시했다.
그러나 <실재대상의 구체적 내용>은 정작 각 주체가 끝내 얻어낼 수 없다.
그래서 <실재는 공하다>고 언어도 표현한다.
다만 이 표현은 <실재에 전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바탕 <실재>는 정확히 무언가가 다양하게 논의된다.
<실재>에 막연히 #를 시설했다.
그러나 이는 곧 <현실 내용과 일치한 내용>이 실재영역에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현실은 <실답지 않다>고 제시한다.
이 경우 <실답지 않음>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각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재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즉 위 경우 C(현실)는 앞의 #(실재)에서 얻을 수 없다.
이런 관계로 <현실>을 <실답지 않다>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는 <꿈이 실답지 않다고 하는 경우>와 성격이 같다.
예를 들어 자면서 <바다 꿈>을 꾸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런 꿈>은 <실답지 않다>고 제시한다.
이는 <꿈 밖의 현실 영역 >에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 침대 등이 일정하게 있다.
그런 상태에서 잠에 들어, <바다 꿈>도 생생하게 꾸었다.
다만 <꿈에서 꾼 바다>는 <침대가 놓인 현실>에서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엉뚱하다.
<꿈이 실답지 않다고 함>은 꿈과 현실간의 이런 사정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실재에 비추어 <현실이 실답지 않다고 함>도 바로 이 측면을 말한다.
이 경우 <실재 영역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재 영역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해야만 <현실이 실답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실재에서 현실 내용을 얻을 수 없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실>은 생생하게 매순간 얻는다.
그러나 <실재 영역>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지 못한다.
이런 차이로 <현실>을 <실답지 않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실재지위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현실 내용>을 곧 <실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감각현실>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혼동하기 쉽다.
그러면 현실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갖게 된다.
따라서 <감각현실>은 <객관적 실재가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색은 객관적 실재 대상이 아니다.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다수 주체>가 , <일정한 시기> <상황>에서 , 일정한 <조건>에 , 일정한 <내용>을 반복해 얻는다.
그래서 현실은 꿈과 달리 대단히 <실답다>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실재>에도 이런 <내용>이나 <관계>가 그대로 있는가 의문을 갖는다.
이 의문은 곧 <실재>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본바탕의 '실재'>는 무엇인가를 추리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실재 대상'>과 '<실재 감관>'의 존재를 막연히 추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관계해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막연히 추리한다.
그런데 실재는 <주체와 관계없이도 본래부터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런데 각 주체는 이런 <실재>를 끝내 직접 얻어낼 수 없다.
각 주체는 제각각 <자신이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은 실재 대상이 아니다.
<실재의 대상>을 찾는다고 하자.
이 경우 우선 기초적으로 다음과 같은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우선 현실에서는 <자신이 얻은 감각현실 내용> 자체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이해하기 쉽다.
<감각현실>은 <다수>가 함께 엇비슷하게 얻음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감각현실> 자체가 <외부의 객관적 실재>인 것으로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다.
이를 <다른 주체>가 <대상>으로 대할 이치는 없다.
따라서 <감각현실>은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은 최소한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결국 <한 주체가 얻는 현실 내용>은 이런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즉, <감각현실>은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관념적 내용은 <외부 실재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실재>를 찾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시 다음처럼 자신이 일으킨 <관념적 내용>을 객관적 실재라고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현실에서 <바위>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
이는 그가 <그 부분>이 곧 그런 <바위>인 것으로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이 때 그가 가리켜 취하는 부분은 <감각현실의 일정 부분 >[상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일으킨 관념>[상想]이 있다.
그런데 그는 이 두 내용의 관계를 다음처럼 잘못 이해한다.
즉 <그러한 감각 현실의 일정부분>[相]을 <그런 관념>[想]이다라고 잘못 이해한다. [참조: 무상삼매해탈]
이는 그가 평소 <감각현실>과 <관념>을 접착시켜 잘못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주체가 평소 자동차로 여기고 가리킨 부분> 전체를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 부분들 전체>를 자동차로 여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퀴 부분>만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 부분을 <바퀴>로 여긴다.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각 부분>을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 때마다 <각 관념>이 나타나기도 하고 숨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그는 다음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즉 <감각현실> 속에서 <그런 관념적 내용>이 각기 숨어 있다.
그리고 <그 감각현실 부분>에서 그런 <관념적 내용>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잘못 여긴다. [참조: 6상]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각부분에 본래 있던 관념적 내용>을 매번 찾아내게 된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그런 감각현실>도 얻는 것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런 <감각현실 부분>[상相]을 처음에 <자신이 대한 외부대상>으로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시 <그 감각현실 부분>에 본래 <관념적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잘못 여길 수 있다.
이 경우 그처럼 <감각현실 안에 들어 있는 관념적 내용>[상想]을 대상으로 <감각현실>을 얻은 것이라고도 잘못 이해 하기 쉽다.
그러나 <관념>은 <감각기관>을 닫아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관념>을 대상으로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서 다음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바위>를 보는 가운데 <자동차>의 생각을 마음에서 떠올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자동차에 대한 관념>을 대상으로 <자동차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
따라서 <관념>은 <감각현실을 얻는 외부대상>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주체가 얻는 감각현실>은 <실재대상>이 아니다.
한편, 한 주체가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이 경우 <그 내용>은 <그 주체의 내부>에 숨는다.
이를 <안경사>의 상황으로 살펴보자.
<안경사>가 <철수>에게 글자를 보여준다.
그리고 <철수>가 <눈>을 뜨고 감게 한다.
이 경우 철<수>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경사>는 <철수가 보는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안경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변화>는 오직 <철수 내부에 있는 변화>라고 여긴다.
즉 <철수가 눈을 뜰 때 본 내용>은 <철수 내부> 안에 위치한다고 여긴다.
이 상황에서 <안경사가 보는 모습>은 따로 있다.
그래서 <안경사가 보는 내용>은 <철수가 본 내용>과는 별개다.
그래서 이는 최소한 <철수가 본 내용>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안경사가 본 모습>은 <철수가 대한 외부 실재 대상>인 것으로 잘못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역시 <안경사가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외부의 실재 대상>은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마음>은 <실재>가 아니다.
한편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 <마음>에 위치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은 한편 <마음에서 얻어진 일체 내용>의 <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재의 관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실재>도 한 주체가 내용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실재>도 <현실 내용의 본바탕>이다.
그래서 <실재>와 <마음>의 개념을 서로 혼동하기 쉽다.
그런데 <실재>는 <한 주체와의 관계를 모두 떠난> 본바탕이다.
그리고 <마음과의 관계도 모두 떠난> 본바탕이다.
<현실 내용>은 마음에서 얻는다.
한편 <마음>은 직접 볼수 없다. 또한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얻어진 현실 내용>과의 <관계>에서 시설된다.
그리고 <실재>는 <이런 마음을 떠나> <본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 밖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을 시설할 때 , 제1식 및 제8식을 시설하게 된다.
이런 경우 다음처럼 이해하기도 한다.
즉 마음은 <다른 마음내용>을 대상으로 <일정한 내용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감각현실>을 대해 <관념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감각현실>도 <제8식의 종자>를 대상으로 얻게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종자설]
그러나 이처럼 <한 주체 안의 다른 마음내용>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들 <감각현실>은 오로지 <각 주체의 개별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수>가 어떤 내용을 함께 <엇비슷하게 얻는 현실 >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를 <여러 주체가 함께 갖는 공종자>로 설명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共種子공종자]
따라서 <감각현실>은 <다른 마음 내용>을 대상으로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Table of Contents
▣- 실재에 대한 다양한 입장
<현실 내용>은 <실재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실재적 주체와 대상>에 대해 다시 추리한다.
이런 경우 <실재적 주체와 대상>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 경우 <현실에서 얻는 내용>을 기초로 추리를 행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실재는 현실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는 <실재는 현실과 적어도 유사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는 <실재는 현실과 완전히 같지 않아도 이에 비례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는 <마음 밖, 실재 영역에는 아무 것도 전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먼저 <실재가 현실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검토해보자.
<실재>는 직접 얻지 못한다.
그래서 끝내 어떤 단정을 내릴 길은 없다.
그런데 <현실 각 영역에서 얻는 내용>부터 먼저 비교해보자.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을 서로 관련시켜 본다.
또 <느낌>이나 <관념분별 내용>을 다시 관련시켜 대조해본다.
이 경우 <이들 각 내용>은 서로 간에 대단히 엉뚱하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본 색 >이 있다.
이는 <귀로 들은 소리>와 대단히 엉뚱하다.
<이들 내용>은 서로 <유사>하거나 <비례>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유무> 여부조차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머지 영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현실에서 이들 <각 영역>에서 <각 내용>을 각기 얻는다.
그래서 이런 <현실 내용>을 기초로 하면, 오히려 다음처럼 생각할 수 있다
어떤 <한 영역>에 <어떤 내용>을 얻는다.
그렇다고 다른 영역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현실 영역> 간에서 그런 경우가 없다.
따라서 <실재와 현실의 관계>도 오히려 이에 준해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실재>는 어떤 주체도 그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한다.[불가득]
각 주체는 <오직 자신이 관계한 내용>만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다, -아니다, -와 같다, -와 다르다. 더럽다 깨끗하다 등 >으로도 분별할 수 없다.
결국 실재는 <2분법상>으로 <분별>할 수 없다. [불이법]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공>이란 표현을 빌려, <공>하다고 표현한다.
이는 <실재에 어떤 특정한 A가 그처럼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 반대로 <실재 영역에 아무 것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의미도 아니다.
즉, '얻지 못해 공함'은 <있고 없음의 분별 자체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주체>로서는 <그 내용>을 끝내 얻을 수 없다.
결국 <앞에 제시한 여러 주장>들도 사정이 같다.
<각 주장의 옳고 그름>을 어느 쪽으로 단정할 도리가 없다.
실재에서 <어떤 단서나 내용>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재의 자신>이나 <실재 대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재영역>에 <자신이나 대상에 해당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어떤 특정한 내용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재는 <한 주체>로서는 끝내 얻을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또 <실재와 아주 무관한 것>이 아니다.
현실은 모두 <실재>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현실>과 <실재>는 서로 떠나 있지 않다.
<실재>를 바탕으로 이런 <현실>을 화합해 얻는다.
다만 <그 실재>를 한 주체가 직접 얻어낼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등의 분별>을 모두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실재의 공함>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그런 가운데 <현실 내용과 실재의 관계>를 살핀다고 하자.
<현실 내용>은 매 순간 생생하게 얻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자신이나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있다.
일단 <이들 현실>은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즉 <실재의 자신>이나 <실재대상>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실재에서 <현실 내용>은 그대로 얻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내용>과 <실재>는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색>은 <정신내용>이다. - 정신 밖 외부 <물질>이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물질>과 색의 <표현의 의미> 차이
<현실>에서 <한 주체>는 <감관>을 통해 <감각현실>을 얻는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좁은 의미의 색色]
또 <귀>로 <소리>를 듣는다.[성聲]
또 <코>로 <냄새>를 맡는다. [향香]
또 <입>으로 <맛>을 느낀다. [미味]
또 <몸>으로 <촉감>을 느낀다. [촉觸]
이를 '<감각현실>'이라고 일단 여기에서 표현하기로 하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들 감각현실 일체>를 <'색>'이라 표현한다.
한편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세계를 <물질>과 <정신>으로 2분한다
그런데 이 경우 <감각현실>을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각 주체가 얻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표시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이 가운데 평소 현실에서 <일반인>이 <물질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손>으로 일일이 가리켜본다.
이 경우 <현실 한 단면>에서 <눈>으로 얻는 <감각현실 전체>가 이에 해당한다.
즉 <눈으로 얻는 내용 일체>를 일반적으로 '<물질>'로 여기게 된다.
나머지 <감각현실>도 마찬가지다. [색色ㆍ성聲ㆍ향香ㆍ미味ㆍ촉觸]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를 <넓은 의미의 색 >(色)'이라 표현한다.
이 경우 <물질>이나 <색>이란 <각 표현으로 가리키는 '부분' >자체는 같다.
일반적으로 <물질로 여기며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색'이란 표현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 주체가 감각해 얻는 감각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두 입장은 단지 <같은 부분에 대한 표현의 차이>뿐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리고 그 표현의 <의미>도 서로 같다고 여기기 쉽다.
이 경우 <그 표현들로 가리킨 부분>은 같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정체나 성격>에 대해서는 각 입장이 다르다.
즉, <그 부분에 부여하는 의미나 지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이들 표현은 <그런 의미나 지위에 대한 해석> 차이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5!) 부분을 <물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일단 (5!) 부분은 <눈으로 본 감각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이들 감각현실>이 <정신과 별개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함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느낌, 분별 등>은 <정신적인 내용>이다라고 평소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감각현실>은 <이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감각현실>은 <정신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해 이해한다.
한편, <정신작용>은 <육체 내 일정 부분 > 안에서 이뤄진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이들 <감각현실>은 <그런 육체 일정 부분 밖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를 <정신>과 구분하는 취지로,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물질이란 표현>은 이런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그런데 (5!) 부분을 <색 >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를 <물질>이라 표현하는 입장과는 다르다.
일단 (5!) 부분은 <눈으로 본 감각현실>이다.
즉 <좁은 의미의 색 >이다.
이는 물론 <느낌>이나, <분별>들과 특성이 구분된다.
즉,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역시 이들은 다 함께 <정신작용을 통해 얻어낸 정신적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같다.
한편, 이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내용>은 모두 <마음>이 얻어낸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마음 안에 머무는 내용>이다.
<마음 밖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색>'과 '<물질>'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다.
<각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다만 <각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은 같다.
그런 사정으로 <'색>'은 <물질>이란 표현과 <의미>도 같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런데 이처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색>'과 '<물질>'이란 표현을 서로 구분해 따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들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 자체는 <감각현실>로서 같다.
그러나 이 <감각현실>에 대해 부여하는 <그 의미나 성격과 지위>를 달리 파악한다.
그래서 표현으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부분을 <중립적인 표현 >으로 '<감각현실>'로 표현하기로 한다.
일반인이 평소 이해하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는 <정신>과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 결과 <감각현실>은 <'마음내용>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기 쉽다.
또는 <감각현실>은 정신과 떨어져 <'정신 밖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생사현실에서 일으키는 망집>과 관련이 깊다.
이 부분을 이하에서 자세하게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색은 <물질>이 아니다 - 논의효용1- 근본정신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단멸관의 제거
<감각현실>을 <색 >이라고 표현한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그런데 이 <감각현실>을 <물질>로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물질>은 정신과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된다.
그래서 이는 <감각현실>이 '<마음내용>이 아니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또 <감각현실>이 <'정신>과 떨어져 <정신 밖>에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단멸관>과 관련된다.
현실에서 평소 <감각현실>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몸>[육체]로 잘못 여긴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 몸>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질>로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음 내용>이 아니다'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
또 <이 부분>이 '<정신>과 떨어져 있다'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음 외부에 있는 객관적 실재>로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잘못된 신견>을 제거하기 곤란해진다.
그런 가운데 한편 <'정신 기관>'도 이런 <육체> 즉 '<물질적 존재'>라고 다시 잘못 여긴다.
그리고 한편 <'정신 작용>'자체도 <육체적 물질적 생리작용>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런 경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육체>로서 <물질적 존재>는 사멸되어 없어진다.
그래서 <죽음> 이후 <자신과 관련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못 여긴다.
따라서 <죽으면 그것으로 아주 없다>고 여긴다.
이것이 <단멸관>이다.
그런 경우는, 짧게 <한 생>에 국한해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짧게 <인과>를 관찰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좋음을 성취할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인과를 넓고 길게 관찰한 경우>와 <반대의 결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구하게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단멸관>은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감각현실>이 <마음 내용>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근본정신과 관련한 마음 현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정신>을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처음에 <감각현실>을 얻는 <마음>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감각을 담당하는 <제1식>부터 <제5식>까지 먼저 파악해 시설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점차 <제6식>과 <제7식>, <제8식>을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잘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바탕에서 <생사윤회의 주체>와 <생사윤회의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죽음 이후 아무 것도 없다>는 잘못된 견해[=단멸관]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또 생사과정에서 <3악도에 처해 받는 생사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더 나아가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 해탈 열반>을 추구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마음의 정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해탈과 열반의 정체>와 <수행 방안>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색은 <물질>이 아니다 - 논의효용2- 정신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집착의 제거
<감각현실>을 <색 >이라고 표현한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이를 <물질>로 이해한다고 하자.
이는 <감각현실>이 <'마음내용>이 아니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또 <감각현실>이 <'정신>과 떨어져 <정신 밖>에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이로 인해 <감각현실>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 >로도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런 경우 <감각현실>에 <집착>을 강하게 갖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받아나가게 된다.
그래서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
<색>이나 <물질>이란 <표현으로 가리킨 부분>이 있다.
이는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한> <감각현실>이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그런데 이들은 <'정신이 얻는 내용'>이다.
그리고 <'정신 안에' 머무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일반이 이해하는> <물질적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평소 한 주체가 <외부 세계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가 평소 <외부 세계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은 사실 그 정체는 <감각현실>이다.
그런데 <감각현실>이 <정신안의 내용>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가 평소 <외부 세계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들 일체는 사실상 모두 <마음내용>임을 이해하게 된다. [3계유심]
그래서 그가 평소 <외부 세계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의 <본 정체>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 즉, <세계>의 <본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이와 함께 그가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대하는 내용>의 <본 정체>도 새로 잘 파악해나갈 수 있다.
한편 <마음>과 <마음이 얻어낸 현실내용>의 관계를 검토해갈 수 있다.
이는 곧 <감각현실>이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님도 함께 의미한다.
한편, <마음>과 <실재>의 관계도 파악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본바탕 실재가 공함>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감각현실> 일체가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망집에 바탕해 행하던 업>도 중지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색>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성격 지위
<감각현실>을 경전에서 <색>이라고 표현한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그런데 <감각현실>을 일반적으로 <물질>로 표현한다.
<이들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은 서로 같다.
예를 들어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그것을 <다음 그림>처럼 표시해볼 수 있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4!) 와 같은 부분을 가리킨다고 하자.
이 경우 <같은 하나의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다.
이 때 이 부분을 먼저 <눈을 떠 얻어낸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는 <'눈>으로 얻은 <감각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 그 부분을 <'눈으로 얻는 좁은 의미의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색경]
또 그 부분을 <'넓은 의미의 색'>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 그 부분을 '<5온 가운데 하나인 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그 부분을 <자신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의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일상에서는 <일반적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처럼 잘못 여긴다.
예를 들어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그 가운데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 몸>으로 잘못 여긴다.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4!) 부분을 '<외부 세상의 한 부분'>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
한편 그 부분을 '<자신의 눈이 대한 외부 대상'>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
한편 그 부분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즉 자신과 영희, 철수가 다 함께 대하는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
한편 이는 <정신>과는 <떨어져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정신적 내용>이 아니라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정신>과 구분되는 <'외부 물질>'이라고도 여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각 경우 <서로 다른 표현들이 가리키는 부분> 자체는 서로 같다.
<감각현실>을 경전에서 <색 >이라고 표현한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그런데 일반 세속에서는 이런 <감각현실>을 <물질>로 표현한다.
이들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은 서로 같다.
그런데 각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하는 <정체>나, <의미>, <지위>, <성격> 등이 다르다.
♥Table of Contents
▣- <색>이라고 표현할 경우의 의미
♥Table of Contents
▣- <색>과 <수ㆍ상ㆍ행ㆍ식>과의 차이
<넓은 의미의 색>은 <감관>을 통해 얻는 <감각현실>을 가리킨다.
즉,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을 가리킨다.
이들은 매순간 비교적 생생하게 얻는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진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연기(인과)에 의존한다. [의타기성]
그리고 <다수주체>가ㆍ<일정시간>ㆍ<상황>에서ㆍ<일정한 관계>로 반복해 얻는다.
반면 <수ㆍ상ㆍ행ㆍ식>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즉 <느낌ㆍ관념ㆍ생각ㆍ분별> 등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다.
또 <개별 주체>별로 <제각각> 달리 얻는다.
그래서 <색>(성ㆍ향ㆍ미ㆍ촉)은 <수ㆍ상ㆍ행ㆍ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경우 <색>과 <수ㆍ상ㆍ행ㆍ식>을 구분함은 위와 같은 <특성 차이>에 의한다.
♥Table of Contents
▣- <색>과 <수ㆍ상ㆍ행ㆍ식>의 <공통성>
<색>은 한 주체가 <감각해 얻은 내용>이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이들 <감각현실>은 <느낌ㆍ관념ㆍ생각ㆍ분별>과 특성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그 주체가 얻어내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통한다.
이런 점에서 <색ㆍ성ㆍ향ㆍ미ㆍ촉>과 <수ㆍ상ㆍ행ㆍ식>은 성격이 같다.
한편 이를 보다 자세히 살핀다고 하자.
그래서 <마음>을 시설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들은 모두 <'마음'이 관계해 마음이 얻어낸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이들은 공통한다.
그래서 이들은 다 함께 <마음내용>이다.
즉, 5온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모두 <마음 내용>이다.
결국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의 <감각현실> 및 <수ㆍ상ㆍ행ㆍ식>은 모두 <마음내용>으로 성격이 같다.
♥Table of Contents
▣- 색은 정신영역 안의 내용이다.
<색>은 한 주체가 감각해 얻은 <감각현실>이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마음이 얻어낸 <마음안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판단>을 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별도로 <마음의 시설 문제>를 살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마음을 떠나 있는 내용>이 아님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다음처럼 제시하게 된다.
이는 <마음안 내용>이다.
다만 감각내용이 곧 '<마음 기능을 행하는'> 마음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마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마음 밖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안 내용>이다.
이는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거울에 화분이 비추였다고 하자.
그 경우 <거울에 비추인 화분모습>이 <거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거울 면>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거울 밖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거울 면 내용>이다.
이와 사정이 같다.
♥Table of Contents
▣- 색을 <물질>이라고 표현할 경우의 의미
<감각현실>을 경전에서 <색>이라고 표현한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감각현실>을 <물질>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들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은 서로 같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 때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 (5!)]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이는 <눈>이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이들은 경전에서는 <좁은 의미의 '색'>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바위나 책상으로 여기는 부분>(4!)을 손으로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를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부분>(1!)을 손으로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도 <물질>로 여긴다.
하나는 <외부의 물질>이다.
하나는 <내부의 물질>>로서 <육체 >이렇게 여긴다.
경전에서 이런 부분 (1!) (4!) 및 (5!)를 모두 <'색>'이라고 표현한다.
이 경우 <각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은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질>은 <정신>과 상대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경우 <그 표현>으로 다음 내용을 함께 나타낸다.
♥Table of Contents
▣- <물질>개념1 - 느낌, 분별 등 <정신적 내용>과 다른 특성을 갖는 내용
일반적인 입장에서 평소 <느낌, 분별 등>은 <정신적 내용>으로 이해한다.
우선 <느낌, 분별>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또 이는 <다른 이>와 공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다.
그러나 철수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각기 <상상>을 하고 시를 쓴다고 하자.
이런 경우 <느낌이나 관념>은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느낌, 분별 등>은 <정신적 내용>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감각현실>은 <눈>으로 대하거나 만질 수 있다.
그리고 <다수 주체>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얻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떠 사과를 본다.
이 상황에서 <영희>가 <눈>을 떠도 비슷한 모습을 본다.
이 경우 <그 사과모습>은 <철수나 영희도 함께 대하는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감각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인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관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감각현실>은 <물리학과 화학>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감각현실>은 <느낌, 분별 등>과는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감각현실>은 <느낌 등>과 달리 <정신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정신적 내용>과 구분해 이를 <물질>로 표현한다.
♥Table of Contents
▣- <물질개념>2 - 정신영역과 <떨어진> 내용
<느낌과 분별>은 <다른 이>와 공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외부의 객관적 내용>은 아님을 쉽게 파악한다.
즉 <여럿이 함께 대하는 내용>이 아님을 쉽게 파악한다.
그리고 이는 <각 주체의 개별적 내용>으로 여긴다.
한편 현실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의 <육체>로 잘못 파악한다.
그리고 <정신기관>은 <각 개인의 육체> '안'에 <들어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정신작용>은 <그런 부분>에서 <이뤄진다>고 잘못 이해한다.
결국 <감각현실>은 위치상, <정신>과는 떨어져 <정신의 외부>에 있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정신과는 별개 내용>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감각현실>과 <정신>을 구분한다.
그래서 <물질>이란 표현은 <정신>과의 상대적 구분을 전제로 한다.
즉 <감각현실>은 <'정신과 위치상 별개로 떨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는 <감각현실>이 <'정신적 내용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자신이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데 평소 이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이나 영희 철수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를 <육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감각현실>인 점에서 특성이 모두 같다.
한편 <정신 기관>은 이런 <육체> <안>에 위치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육체>는 그런 <정신 기관> <밖>에 위치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육체>도 <물질>에 포함된다.
그래서 <육체>란 표현도 역시 <정신>과의 <상대적 구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 입장은 <정신기관>이나 <정신작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정신 기관>은 그런 <육체>의 한 부분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정신작용>도 그런 주체의 <몸>(육체) 부분에서 행해진다고 잘못 여긴다.
더 나아가 <정신작용>은 <외부 물질>의 <운동>과 <육체 내 물질>의 <자극-반응관계>로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감각현실>을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Table of Contents
▣- <색>이 갖는 <물질>적 측면
<감각현실>을 경전에서 <'색>'이라고 표현한다. [넓은 의미의 색 = (색ㆍ성ㆍ향ㆍ미ㆍ촉) ]
그런데 일반적 입장에서는 <감각현실>을 <물질>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들 <각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은 서로 같다.
즉, 이들 표현은 다 함께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감각현실>'을 가리킨다.
즉
<눈>을 통해 얻는 내용[색]
<귀>를 통해 얻는 소리[성]
<코>를 통해 얻는 냄새[향]
<혀>를 통해 얻는 맛[미]
<몸>을 통해 얻는 촉감[촉]이다.
이런 <감각현실>은 '마음이 얻는' <마음내용>이다.
그리고 <감각현실>은 <'정신 안의 내용'>이다. 그래서 <정신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각현실>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감각현실>은 다른 <수ㆍ상ㆍ행ㆍ식>과 어느 정도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감각현실>은 다른 <느낌ㆍ관념ㆍ생각ㆍ분별>과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할 의미는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구분>된다.
만일 <물질>이란 표현을 <다음의 특성>만 가리키는 제한적 의미로만 사용한다고 하자.
즉, <느낌ㆍ관념ㆍ생각ㆍ분별> 및 그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각 주체별>로 개별적이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이런 특성을 갖지 않는다.
<감각현실>은 반대로 매순간 생생하다.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다.
또 <다수 주체>가 <일정 시간>과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 관계>로 <반복>해 얻게 된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구분>할 의미는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만을 나타내기 위해, <물질>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자.
이는 <물질>이란 표현이 갖는 <최소한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런 경우 <감각현실>은 어느 정도 <물질적 특성>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감각현실>에 대해 <물질과 정신의 상대적 구분>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
이런 특질 차이로 <수ㆍ상ㆍ행ㆍ식>을 묶어 <심>(정신)으로 따로 표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색>ㆍ<심>( 수ㆍ상ㆍ행ㆍ식)의 분류는 이 정도의 <구분> 의미를 갖는다. [5위법]
결국 <감각현실>은 이들과 이 정도의 특질 <차이>는 갖는다.
<물질>은 <정신>과 상대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물질>이란 <표현>이 다음 의미를 갖는다고 하자.
<물질>은 <정신이 얻어내지 않은 내용> 이다.
<물질>은 정신 <밖>에 머무는 내용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러나 <감각현실>은 <정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감각현실>은 정신 <안>에 머무는 내용이다.
따라서 <감각현실>은 이런 의미로서의 <물질>은 아니다.
그러나 <감각현실>은 <느낌, 분별 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생생하게 보이거나 만져진다.
또 어느 정도 다수에게 일정한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물리 화학법칙>이 적용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물질>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감각현실>은 <물질적> 특성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물질>이란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이 <물질>적 특성을 갖는 사정
한편, <감각현실>은 <느낌 분별 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다수 주체>가 <일정 시간>과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 관계>로 반복해 얻게 된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물리나 화학>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정 때문에 <감각현실>이 곧 <외부의 객관적 실재>인 것으로 잘못 판단한다.
그런데 <그 사정>이 그렇지 않다.
<감각현실>은 한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다른 주체>인 <영희>나 <철수>가 상대할 이치가 없다.
<자신>도 <영희, 철수가 얻어내는 내용>을 직접 상대할 수 없다.
<영희>나 <철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외부의 객관적 실재>는 아니다.
그래서 <감각현실>이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배경사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감각현실>은 마치 <외부의 객관적 실재>인듯한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는 <다음 사정>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는 <감각현실>이 <본바탕 실재>와 좀 더 밀접하기 때문이다.
즉 <본바탕 실재>를 비슷한 감관을 가진 <다수 주체>들이 함께 대한다.
이런 사정으로 <감각현실>은 <다수 주체>에게 좀 더 엇비슷한 <객관적 형태>가 된다.
다만 이런 측면도 <한계>는 있다.
생명 가운데는 <감관이 다른 주체>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공통성이 잘 얻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의 후각, <박쥐>의 감각, <방울뱀>의 감각, <인간>의 감각이 서로 공통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편, <느낌, 생각 등>은 <감각현실>과 좀 더 뚜렷하게 <주관성>을 갖는다.
현실에서 <느낌, 생각 등>은 <감각현실>에 기초해 발생한다.
다만 이 과정에 한 주체의 <그간의 경험>들이 반영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주체의 <느낌, 생각>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집>을 여럿이 같이 대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집> 안에서 각 주체가 다른 경험을 해왔다고 하자.
그래서 각 주체마다 내력과 배경이 다르다.
그런 경우 그 집을 대하면서 <좋고 나쁜 느낌>을 달리 얻게 된다.
이런 사정으로 <감각현실>과 <느낌 관념>은 특성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구분>은 최소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내용은 이미 앞부분에서도 살폈다.
[- <감각현실>이 다수에게 일정한 관계로 반복 파악되는 사정]
♥Table of Contents
▣- <색>이 <물질>과 다른 측면
<감각현실>을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이 아니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또 <감각현실>이 정신과 떨어져 <'정신 밖에 있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잘못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물질>이란 표현이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감각현실>을 <이런 의미의 물질>로 이해함은 잘못이다.
<이런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 경우 <이를 밝혀내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밝혀 나가야 한다.
<감각현실>은 최소한 <느낌, 생각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물질>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자.
즉, <물질>은 <느낌, 생각 등>과는 <성격>이 다른 내용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감각현실>이 <물질적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감각현실>은 '정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그런데 <물질>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자.
즉 <물질>은 <정신 밖에 있는 것> 그리고 <마음내용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감각현실>을 <물질적 내용>이라고 표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물질>이란 표현이 갖는 의미부터 먼저 명확히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이 여러 의미를 가져서 일으키는 혼동>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논의가 어떤 측면을 <초점>으로 두는 것인지부터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여기서는 <감각현실>이 '<정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힘에 있다.
즉, <감각현실>이 <'정신 안에 있는 내용'>임을 밝히는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를 밝히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감각현실>이 <어떤 위치>에 머무는가를 또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감각현실>을 얻는 <어떤 기관>을 그릇으로 중립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자.
그런데 통상 이런 내용을 담는 그릇을 <정신> 또는 <정신기관>이라고 칭한다.
다만 <이런 표현>을 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전제로 이런 그릇의 정체가 <정신적 내용>인가 <물질적 내용>인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한 주체는 <얻어진 내용>만 얻는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얻는 그릇>은 <그릇 자신>을 얻지는 못한다.
즉 <마음>은 <마음>을 직접 얻지 못한다.
마치 <눈>은 <눈>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과 사정이 같다.
그래서 직접 이 <그릇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 다음 방안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그 그릇이 행하는 작용>이 <물질적 반응관계>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 그릇이 과연 <정신적 그릇>인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순서상 뒤에 살피기로 한다.
이런 사정으로 <감각현실을 담는 그릇>이 <정신적 그릇>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단순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그릇(~정신)'이라고만 표현하기로 한다.
또한 이 그릇(~정신)이 행하는 <작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일단 '그릇(~정신)의 작용'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를 미리 <'정신기관'>이나 <'정신작용'>으로 전제하지는 않기로 한다.
한편, 이런 사정으로 <감각현실을 담는 그릇>이 <정신적 그릇>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그릇>들의 위치부터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느낌>이나 <관념> 내용을 담는 <그릇>의 위치 부터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이를 기초로 <감각현실>과 <정신적 그릇>(~정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감각현실>이 <정신적 그릇>(~정신) <안>에 들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쉽게 다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즉, <감각현실>은 <정신적 그릇>(~정신) <밖>에 있는 것[-<물질>]이 아니다.
물론 <감각현실>은 여전히 <느낌 분별 등>과 특질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물질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감각현실>은 <정신적 그릇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임을 밝히게 된다.
그런데 정작 <그런 그릇>(~정신)의 <정체>를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한 주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만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해 <생리학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이런 입장이 갖는 문제점을 살피기로 한다.
우선 이 입장에서는 이런 그릇(~정신)의 <위치>를 잘못 잡는다.
즉 평소 일반적으로 <영희나 철수의 몸>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 안에 <이런 그릇>(~정신)이 위치한다고 설정한다.
그 다음 <이 그릇>은 <물질적 그릇>으로 파악한다.
즉 해부시 보게 되는 <육체 안의 뇌와 같은 부분>을 <그런 그릇>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그릇(~정신)의 <작용>도 <물질적인 자극 반응 관계>로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물리나 화학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 <이런 일반적 견해>가 잘못임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제 2 차적으로 그릇(~정신)의 <성격> 논의가 행해지게 된다.
이는 <생리학자가 처음 살핀 성격> 논의와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이 경우 <내용을 담는 그릇>(~정신)은 최소한 <관찰자인 그 생리학자가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게 된다.
그런데 한 주체는 <이런 그릇>(~정신)을 '직접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그릇(~정신)이 <물질적인 그릇>인가 여부를 추리해 살피게 된다.
그러나 <어떤 관찰 주체>도 그릇(~정신)은 직접 얻지 못한다.
사정이 그렇다.
따라서,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을 기초로 추리를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그 작용은 <물질적 변화과정>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보게 된다.
그래서 그 그릇(~정신)의 작용은 결국 <정신적 특성>을 갖는다고 보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관찰 주체는 <이런 그릇>(~정신)이나 <그 작용>을 직접 얻어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현실에서 얻는 내용>은 <그런 그릇>과 관계가 밀접하다.
따라서 <현실에서 얻는 내용>을 기초로 <그런 그릇>(~정신)을 간접적으로 추리하게 된다.
그래서 <논의의 어려움>이 있다.
즉 <마음>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문제를 갖는다.
<마음>은 <마음>을 직접 얻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얻어낸 내용>을 기초로 <마음>의 존재를 역으로 시설해가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후 <마음의 종류>를 <제1식>부터 ~<제8식>까지 시설해나가게 된다.
아래에서 이 대강을 살펴나가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감각 과정>'을 <물질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 - <생리학자> 입장
<감각현실을 얻는 과정>을 <물질적 반응관계>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여기서 <물질적 반응관계>로 이해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우선 <감각현실>은 일반적으로 다음 특성을 갖는다.
매순간 <생생>하다.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또 <다수 주체>가 <일정 시간>과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반복해 얻게 된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들 변화관계는 <물리 화학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한다.
예를 들어 <돌>을 <호수>에 떨어뜨린다고 하자.
그러면 물결 <파장>이 일어난다.
그것이 점점 퍼져 <호숫가>에 다다른다.
또는 <도미노>를 쌓아 놓는다.
그리고 하나를 쓰러뜨린다.
그러면 <도미노>가 연이어 쓰러진다.
이처럼 <감각현실>은 <운동변화과정>에서 각 부분 간 <일정한 관계>를 보인다.
그래서 <감각현실>에서 <작용반작용>, <관성>, <가속도의 법칙>과 같은 <물리적 운동 법칙>을 파악한다.
그리고 <나무>를 태운다.
그러면 <불>과 <연기>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변화 전후, <성품과 모습>이 달라진다.
이는 <화학적 변화 관계>다.
그런데 <한 주체가 감각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한다.
그래서 <정신작용>을 <육체 내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해당한다고 이해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된다.
<생리학자의 판단>도 이와 사정이 같다.
그런데 이에는 <일정한 배경사정>이 있다.
우선 <자신의 몸>의 <위치>를 잘못 파악한다.
어떤 이가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가운데 <일정 부분 >을 취해 <자신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신견]
이러한 내용부터가 잘못이다.
그런데 그런 바탕에서 다시 <감각현실>을 먼저 <자신(몸)>과 <그 나머지 외부 세상>으로 나눈다.
즉, <감각현실>을 <자신>과 <외부세상>으로 구분해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감각현실>을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이라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다시 자신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를 문제삼는다고 하자.
이 때 <이런 내용을 얻는 부분>을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이 경우 먼저 <그런 그릇>이 위치한 부분을 잘못 파악한다.
즉, 그는 먼저 <몸>을 <잘못> 파악한다. [신견]
그리고 <그런 몸 부분>을 <물질적 육체>로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관>은 <그런 육체 부분>에 위치한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그런 감관 부분>에 의해 자신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얻는 그릇>은 <이런 몸> <'안>'에 들어 있다고 잘못 여긴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낸 <감각현실>의 <정체>를 살핀다고 하자.
그런데 처음에 <감각현실>을 <자신>과 <외부세상>으로 구분해 이해했다.
그리고 <이런 감각현실>을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이라고 잘못 여긴다.
따라서 이 경우 <감각현실>은 <이런 그릇>과는 <별개로 떨어진 내용>으로 보게 된다.
<그런 그릇>은 그가 <몸>으로 보는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그릇>을 <정신적 기관>으로 파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편 <그런 그릇>도 <육체 내부>의 <물질적 기관>으로 잘못 파악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 주체의 몸>을 해부한다고 하자.
그러면 <뇌로 보이는 부분>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 곧 <그런 내용이 담기는 그릇>으로 잘못 이해한다.
결국 <일반적으로 정신으로 이해하는 내용>도 <물질적 존재>라고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다시 <그릇이 행하는 작용>도 다음처럼 잘못 파악한다.
즉, <그런 작용>은 <외부대상>과 <육체> 사이의 <물질 반응관계 >로 이뤄진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육체 내 물질> 안에서 <자극 - 반응의 일련관계>가 이뤄진다고 잘못 여긴다.
결국 <이런 그릇의 작용>도 <이런 육체> 안에서 이뤄진다고 잘못 이해한다.
예를 들어 <눈>을 뜰 때 <보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이해한다.
<외부대상>에 <빛>이 비추인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가시광선 가운데 <일부파장>을 흡수하고 <일부파장>을 반사시킨다.
그것이 눈의 <수정체>를 통과한다.
그리고 그것이 <망막의 간상세포(杆狀細胞)> 내 <광수용체 > 로돕신 등을 자극한다.
그래서 <명암>에 따른 <화학반응>을 한다.
(로돕신rhodopsin → 레티날retinal + 옵신opsin)
한편 <망막의 3 종류 원추세포(圓錐細胞)>가 적,녹,청 색상에 따라 반응한다. (적추체, 녹추체, 청추체)
이 과정에서는 <아이오돕신iodopsin> 등과 관련한 <화학반응 >을 한다.
그래서 <색상>에 따른 <화학반응>을 한다.
(아이오돕신iodopsin → 레티넨retinene + 포톱신Photopsin)
그리고 <시신경>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 대뇌 피질 부분>에서 <이에 따른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이 <한 주체가 보게 되는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생리학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생리학자의 입장이 잘못인 사정
<생리학자의 입장 >은 <잘못된 판단 >으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이가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신견]
또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취해 <영희나 철수 등 >으로 잘못 여긴다. [타인에 대한 판단 잘못]
그런 가운데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를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 >이라고 잘못 여긴다. [외부대상에 대한 판단잘못]
한편 <자신의 감관>이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부분>에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자신의 감관의 위치에 대한 판단잘못]
마찬가지로 <영희나 철수의 감관 >은 <생리학자가 영희 철수의 몸으로 보는 부분>에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타인에 감관의 위치에 대한 판단 잘못]
그리고 이들이 서로 <자극 반응의 관계 >를 갖는다고 여긴다.
###
♥Table of Contents
▣- 몸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평소 <자신의 몸>이나 <외부 세상>으로 여긴 내용이 있다고 하자.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을 이치는 없다.
또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외부세상>이 들어가 있을 이치는 없다.
또한 <자신이 얻어낸 내용>에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영희나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결국 처음에 <감각현실> 일정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본 판단이 잘못이다.
그리고 <감각현실>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 영희나 철수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외부세상>, <외부대상>, <감관>도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이런 내용에 <외부세상>, <외부대상>, <자신의 감관> , <타인의 감관> 등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이런 판단들이 잘못임>은 <신견>과 <외부 세상>에 대해 살피는 과정에서 살폈다.
따라서 여기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생리학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이처럼 <각 주체의 몸>을 잘못 파악한다.
즉 <자신이 얻어낸 내용>의 일부분을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 등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상태에서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 <머무는 위치>도 역시 잘못 판단한다.
즉, 어떤 주체가 눈을 뜨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그렇게 얻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가 문제된다고 하자.
이 때 <이런 내용을 얻는 부분>을 <하나의 그릇>(~정신)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데 <생리학자>는 이들 내용이 <앞과 같은 몸> 안에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다른 이> 철수의 <감각작용>을 관찰한다고 하자.
이 때 철수는 눈을 뜨면 <보인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이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 두 상황 사이에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 변화는 <그런 철수 내부의 문제>로 여기게 된다.
이런 사정으로 <철수가 얻는 내용>은 <철수 몸> 안에 위치한다고 여긴다.
한편 철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얻는 내용>도 그와 같다고 여긴다.
그래서 <자신이 얻는 내용> 역시 이와 같이 <자신 몸> 안에 위치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잘못된 판단이다.
이들은 제각각 <각 주체가 얻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 안에, 철수나 자기자신 등, <각 주체>가 우선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얻는 내용>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 몸>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얻는 내용> 일부분인 <자신 몸> 부분에, <그가 얻는 내용 전체>가 들어가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얻는 내용> 일부분에 <그 내용 전체를 얻어내는 그릇>이 있을 이치가 없다.
또한 <다른 이> 철수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즉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철수 등 <타인의 몸> 이 들어가 있을 이치가 없다.
더욱이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철수 등 <타인이 감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이치 역시 없다.
그래서 이런 <생리학자>의 견해는 모두 잘못이다.
이를 아래처럼 <각 경우>를 나눠 살펴보자 .
♥Table of Contents
▣- 자신이 얻는 내용물이 담기는 그릇(~정신)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현실에서 자신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는 그릇>(~정신)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그릇>(~정신)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얻는 내용>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눈을 떠 얻는 내용>부터 살펴보자.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평소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예: (1!)]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이처럼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을 이치는 없다.
이를 이미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한편 <자신이 얻는 내용>이 있다.
<이들 내용> 전체가 평소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부분>에 위치한다고 잘못 여긴다. [예: (1!) 내부]
그래서 평소 <자신 몸으로 여기는 부분>에 <이런 그릇>(~정신)도 존재한다고 잘못 여긴다. [예: (1!) 내부]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에 <그 내용> '전체'가 담겨 있을 이치도 없다.
더욱이 처음 <자신의 몸>에 대한 판단부터 잘못이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에 <자신>이 들어 가 있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들 판단>은 모두 잘못이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사람이 얻는 <내용물 그릇>(~정신)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자신이 <다른 사람> 철수, 영회등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자신에 대한 판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를 판단하게 된다.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평소 <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로 잘못 여긴다. [예: (2!), (3!)]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형식이 같다.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이처럼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이들이 잘못인 사정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그런 가운데 <철수>를 놓고 자신이 관찰한다고 하자.
옆에 철수가 있다.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무엇인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눈을 감는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자신>이 옆에서 이를 관찰한다고 하자.
이 경우 별다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는 오직 <철수 내부에서의 변화>로 추정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를 현재 <철수>로 잘못 여기고 있다. [예: (2!)]
그리고 그런 변화는 <그 부분>의 겉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그런 부분> 안에서의 변화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철수가 얻는 내용> 전체는 <철수의 몸 부분> 안에 들어 있다고 이해한다. [예: (2!) 내부]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는 철수의 그릇>(~정신)을 생각한다고 하자.
이 역시 그처럼 <철수의 몸> 안에 있다고 잘못 여긴다.
여기까지가 자신의 철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다만 이런 이해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에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가 얻어낸 그 내용> '전체'가 담겨 있을 이치는 없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잘못임을 쉽게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른 이> 철수가 행하는 판단을 놓고 살펴 검토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이해>가 잘못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이> 철수가 <앞과 같은 상황>에서 행하게 되는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사람>이 행하는 다른 사람 <자신>에 대한 판단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철수>를 옆에 놓고 <자신>이 관찰한다. [예: (2!)]
상황은 앞에서 살핀 것과 같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철수>를 관찰한다고 하자.
이 경우 철수가 <눈을 떠 얻는 내용>을 추정해본다.
1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그것을 얻지 못한다.
다만 철수와의 언어소통을 통해 <그 내용들>을 대강 추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에 <그런 내용>을 대강 표시한다. [예: (5^)]
그런데 이 상황에서 <철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다음처럼> 이해한다고 하자.
우선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철수자신>으로 여긴다. [예: (2^)]
그리고 <철수가 얻는 내용>은 <스스로 철수 자신으로 보는 부분> 안에 위치한다고 이해한다. [예: (2^)의 내부]
또 <그런 내용을 담는 그릇>(~정신)도 그처럼 <철수 몸> 안에 위치한다고 이해한다. [예: (2^)의 내부]
그리고 이 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정신활동>이 이뤄진다.
즉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여러 정신활동>을 행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처럼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것을 <철수 자신>이라고 관념한다.
그런 경우 자신이 <이런 철수의 판단>을 검토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이해>가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들 내용>은 우선 모두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그 안에 우선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나머지 내용>도 사정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런 철수의 판단>은 모두 잘못임을 쉽게 이해한다.
♥Table of Contents
▣-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그릇(~정신)에 대해 행하는 잘못된 판단
철수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철수는 다음처럼 잘못 판단하게 된다.
우선 철수가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 1>로 잘못 여긴다. [예: (1^)]
그리고 철수가 <1이 눈을 떠 무언가 보는 과정>을 관찰한다고 하자.
그 경우 1 이 <눈을 뜨면 보인다>고 보고한다.
또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철수 입장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 철수는 그런 변화가 오직 <1 내부에서만의 일>이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1이 얻어낸 내용은 <1의 몸> 안에 위치한다고 추정한다. [예: (1^)]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는 1의 그릇>(~정신)도 그처럼 <1의 몸> 안에 위치한다고 추정한다. [예: (1^)안의 내부]
♥Table of Contents
▣- <다른 사람 철수>가 행하는 판단들의 검토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8을 얻는다.
<그런 내용을 얻는 그릇>의 위치가 문제된다.
그런데 철수가 <그런 그릇의 위치>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철수의 판단 내용>을 자신이 검토해본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철수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파악한다.
이들 내용은 모두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 내용> 안에 우선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리고 '<철수가 얻는 그런 내용'> 전부가 다시 '<그처럼 철수가 얻는 내용 일부분>'[철수 몸] 안에 모두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철수가 <다른 사람>에 대해 행하는 판단도 잘못이다.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안에 <1이나 영희와 같은 다른 사람>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그리고 <1이나 영희와 같은 다른 사람>이 <눈을 떠 얻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철수가 얻는 내용> 안에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그런데 철수가 이처럼 판단한다.
따라서 <이런 판단>은 모두 잘못이다.
그래서 이처럼 행하는 철수의 <판단>이 모두 잘못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사실 <1 자신>도 이런 형태로 평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1 자신의 판단>도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그런 사정을 미루어 이해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자신이 행하는 <그릇(~정신)의 위치>에 대한 판단의 검토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정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이런 판단>부터 잘못이다.
이들은 <자신이 얻은 내용>이다.
<이 안>에 <그런 내용을 얻는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한편 <몸으로 여긴 부분>은 <자신이 얻은 내용 일부분>이다.
<자신이 얻은 내용 일부분> 안에 <자신이 얻는 내용 전체>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즉 <몸으로 여긴 부분>안에 <자신이 얻는 내용 전체>가 들어 있을 <그릇(~정신)>이 위치할 이치가 없다.
따라서 <그런 이해>는 잘못이다.
한편 <자신이 얻은 내용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로 여긴다.
이들은 <자신이 얻은 내용>이다.
이 안에 <다른 사람>철수나 영희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한편 <철수나 영희가 얻은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처럼 <다른 사람들이 얻은 내용>이 <자신이 얻는 내용> 안에 위치할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이들 판단>은 모두 잘못이다.
♥Table of Contents
▣- 그릇(~정신)의 위치는 <한 주체가 얻는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들 내용 전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얻는 <실질적인 자신>을 찾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자신이 얻은 내용> 안에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그런 경우 최소한 <이렇게 얻어낸 내용> 밖에서 <실질적인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 그런 <실질적인 자신>아 위치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한편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 위치하는 부분을 찾는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얻어낸 내용>의 '일부'에 <그 내용 '전체'>가 위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은 얻어진 내용 그대로 <그 위치>라고 보면 된다.
다만 한 주체는 <얻어진 내용>만 얻는다.
따라서 이들 위치를 판단할 <다른 기준>은 따로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단지 그런 내용이 <그렇게 있다>고 할 도리 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담는 그릇(~정신)을 찾는다고 하자.
우선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이들 내용을 얻는 그릇>(~정신)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담는 그릇>(~정신)은 최소한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한편, 이는 <눈을 떠 얻는 내용>과 관련해 살핀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감각현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색ㆍ성ㆍ향ㆍ미ㆍ촉]
한편 <느낌> <관념>도 마찬가지다. [수ㆍ상ㆍ행ㆍ식]
<자신이 얻어낸 이들 내용>은 <얻어진 내용> 그대로 <그 위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얻는 그릇>(~정신)의 위치를 찾는다고 하자.
이런 그릇(~정신)은 <이처럼 얻어낸 내용> 안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처럼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그 차이가 대단히 크다.
이를 <비유>로 설명해보자.
<바다 전체>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자.
그런데 <바다 가운데 물방울> 하나를 취한다.
그리고 이 안에 <자신의 마음>이 위치한다고 여긴다.
이는 뒤바뀌어 잘못 판단한 <전도된 망상 분별>이 되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눈을 떠 <자신의 모습>을 본다.
이 경우 <자신의 뒷머리>나 <눈>을 스스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자신이 <다른 철수>를 볼 때와는 다르다.
그것은 이들 내용이 <자신의 마음안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이> 철수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을 통해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 하자.
이 경우 <다른 이> 철수에 대한 판단도 이에 준한다.
우선 자신이 <다른 사람> 철수와 언어 소통을 한다.
그래서 <철수가 어떤 내용을 얻는다>는 사실을 추리하게 된다.
또한 <그런 내용을 얻는 철수>의 존재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얻는 내용> 밖에서 <실질적인 자신>을 찾는다고 하자.
그리고 <자신이 얻는 내용> 밖에서 '<그런 내용을 얻는 그릇>(~정신)'을 찾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 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얻는 내용> 밖에서 <실질적인 철수>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얻는 내용> 안에 <다른 사람>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상황에서 <철수가 얻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얻는 <실질적인 철수>의 위치를 찾는다고 하자.
그런 <실질적인 철수>가 <철수가 얻어낸 내용> 안에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철수>는 최소한 <철수가 얻는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철수가 내용을 얻는 그릇>(~정신)도 마찬가지다.
<철수가 얻어낸 내용>은 역시 <철수가 얻는 내용> <그대로 그 위치>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얻는 철수의 그릇>(~정신)의 위치를 찾는다고 하자.
우선 <철수의 그릇>(~정신)이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있을 이치는 없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서 <그런 철수의 그릇>(~정신)을 찾아야 한다.
한편, <철수의 그릇>(~정신)은 <철수가 얻어낸 내용> 안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경우 이런 그릇(~정신)은 모두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그릇(~정신)과 실재의 문제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때 그런 내용을 얻는 <그릇>을 찾는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릇(~정신)은 모두,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 밖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각 주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만 얻게 된다.
그래서 각 주체는 <자신이 얻는 내용> 밖의 내용을 직접 얻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이런 <그릇>(~정신)을 찾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실재>를 찾는 문제와 성격이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문제 삼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서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실재>는 한 주체와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그릇>(~정신)은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한다.
즉, 다음과 같다.
우선 한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담는 <그릇>(~정신)을 찾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얻어진 내용>을 기초로, 그런 <그릇>(~정신)을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그러나 <실재>는 이런 주체나 내용과의 관계를 모두 떠난다.
그래서 <본바탕>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찾는다.
따라서 <그릇>(~정신)과 <실재>의 문제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의 <지위>나 성격>에 대해 서로 혼동을 일으키면 곤란하다.
다만 각 주체가 <그 내용을 직접 얻을 수 없는 점>이 공통할 뿐이다.
이는 각 주체가 <자신이 관계해 얻는 내용>만 직접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내용이 담기는 부분을 하나의 <그릇>(~정신)처럼 일단 생각한다고 하자.
이 경우 우선 그릇(~정신)의 <정체> 파악이 문제된다. [정신기관]
그 다음 그 그릇(~정신)에 일정한 내용이 담기는 <과정이나 작용>이 문제된다. [정신작용]
그리고 그 그릇(~정신)에 담겨진 <내용>의 정체가 문제된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이들 가운데 현실에서는 그릇(~정신)에 담겨진 <내용>은 한 주체가 얻는다.
한 주체는 물론 이런 그릇(~정신)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릇>(~정신) 자체는 자신이 직접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그릇(~정신)은 모두 자신이 <얻어내는 내용>을 기초로 추리해 시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경우 그릇(~정신)은 최소한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 과 별도로 시설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그 그릇(~정신)은 <얻어낸 내용>과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거울>과 <거울면에 비추인 내용>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처럼 한 주체가 <얻는 내용>과 별도로 그 그릇(~정신)을 찾는다고 하자.
이 경우 그 그릇(~정신)은 <현실에서 얻는 내용의 분류 구분> 문제를 일단 떠나게 된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얻는 내용>을 놓고 일단 <분류 구분>을 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이 <감각현실>인가. <느낌, 관념, 생각, 분별>인가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얻는 그릇은 <감각현실>도 아니다.
또 <느낌, 관념, 생각, 분별>도 아니다.
따라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그릇은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한주체가 그런 그릇(~정신)에 바탕해 일정한 <작용>을 한다고 하자.
그 경우 현실에서 그릇(~정신)에 담겨지는 <내용>은 한 주체가 얻는다.
그러나 <그릇>(~정신)이 행하는 <그 작용> 자체를 자신이 직접 얻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입장에 따라서는 이들 작용 자체를 직접 자신이 얻어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마치 눈을 떠 꽃 모습을 보듯, 자신이 스스로 <이들 내용을 얻는 과정> 자체도 파악해 얻는다는 주장이다. [자증분, 증자증분 등의 문제]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작용은 이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런 작용을 추리해 시설하는 것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얻는 내용>을 토대로 <그런 내용>을 얻게 하는 <작용>을 별개로추리해 시설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그릇(~정신)에 대한 실험관찰의 곤란성
각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얻어내는 <그릇>(~정신)을 추리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 그릇>(~정신)을 넣고 빼며 관찰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그릇(~정신)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단 이 그릇(~정신)을 직접 얻어내기 힘들다.
이것은 자신의 경우나 타인의 경우에서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설령 타인을 해부하면서 관찰하려해도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이 사정부터 먼저 잘 파악해야 한다.
먼저 이 그릇(~정신)을 <육체의 일부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또는 이와 달리 <비육체적인 형태>라고 여길 수도 있다.
만일 이 그릇(~정신)을 <비육체적인 형태>라고 여긴다고 하자.
즉 <정신적인 내용>으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에서 각 주체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그런 그릇(~정신)이 <얻어낸 내용>만을 얻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그릇(~정신)을 넣고 빼고 하는 실험 자체를 행하기 곤란하다.
그것은 <다른 타인>을 관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타인일 때는 <그 주체가 얻어내는 내용>까지도 확인하기 곤란하다.
한편 이런 그릇(~정신)을 <육체의 일부분>이라고 여긴다고 하자.
이 경우 그런 그릇(~정신)으로 여기는 <육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 있는 가운데 <그 부분>을 스스로 분해하거나 떼어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하기 곤란하다.
한편, 생리학자가 <다른 이>를 관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생리학자가 다른 동물을 묶어 이런 해부실험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각 경우 그 다른 생명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다른 생명이 <눈을 떠 얻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생리학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각작용을 이런 방식으로 관찰함에는 어려움이 있다.
♥Table of Contents
▣- 감각작용은 <물질>적인 변화과정에 준하지 않는다.
<감각현실>을 담는 그릇(~정신)을 살피려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그릇은 <한 주체가 얻는 내용> 밖에서 찾게 된다.
그 런 경우 이 그릇(~정신)은 끝내 직접 한 주체가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 그릇(~정신)이 정신적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단정하기 힘들게 된다.
또 타인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그릇(~정신)을 관찰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 주체의 그릇(~정신)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런 상태에서 그 그릇(~정신)이 <물질>적인가 <정신>적인가를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그 그릇(~정신)과 작용은 <물질적인 특성>을 갖는가가 여전히 문제된다.
그런 경우 결국 이 추리는 <현실 내용>을 기초로 행하게 된다.
안경사가 <철수가 보는 과정>을 관찰한다고 하자.
탁자위에 사과가 놓여 있다.
이 <사과>를 상자로 가린다.
그러면 철수는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사과를 가렸던 상자를 치운다.
그러면 철수는 <사과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한편 전등 <빛>을 끈다.
그러면 또 철수는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전등 빛을 켠다.
그러면 철수는 <사과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철수의 <눈>을 수저로 가린다.
그러면 또 철수는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눈을 가린 수저를 치운다.
그러면 철수는 <사과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이런 동작을 매번 반복한다.
그러면 반복할 때마다 같은 결과를 보고한다.
그리고 그런 현실 상태에서 철수는 무언가 보고 느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다.
이 경우 이 일련의 과정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 경우 <안경사가 본 사과>를 <철수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 >으로 오해한다.
또 <안경사가 본 전등빛>은 <대상과 철수 사이의 중간매개물>로 오해한다.
또 <안경사가 본 철수의 눈>을 <철수의 감관>으로 오해한다.
물론 <안경사가 본 사과>을 <철수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 >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또 또 <안경사가 본 철수의 눈>을 <철수의 감관>이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이다.
이들 내용은 모두 이를 관찰한 <안경사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철수>가 <안경사가 얻어낸 내용>을 대상으로 대할 이치는 없다.
또 <안경사가 얻어낸 내용> 안에 <다른 사람 철수의 감관>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한편, 정작 안경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얻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철수>는 감각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안경사가 얻어낸 내용>이 철수의 감각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안경사가 얻어낸 내용>은 <철수의 감관>이나 <철수가 대한 외부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안경사가 관찰할 때는 이와 같은 관계로 각 부분이 파악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철수의 감관>이나 <철수가 대한 외부대상>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 부분이 이처럼 일정한 관계로 파악되게 되는 배경 사정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을 이미 여러 곳에서 살폈다.
(참고 ▣- <감각현실>이 다수에게 일정한 관계로 반복 파악되는 사정)
(참고 ▣- 다수가 일정 내용을 반복 경험하기에 그 실재가 있다고 여김)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간단히 요약해 붙이기로 한다.
현실에서 <감각현실>을 <다수 주체>가 함께 엇비슷하게 얻는다.
이런 경우 실재영역에 막연히 일정한 대상을 있다고 일단 추리해 시설한다.
그런데 각 주체의 <감관>등의 상태가 엇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실재 대상>을 각 주체가 엇비슷한 관계로 대한다.
그래서 각 주체는 <엇비슷한 내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해야 한다.
만일 <감각현실>이 순전히 <한 주체 내부의 사정>만으로 얻어진다고 하자.
[예: 한 주체의 근본식 안의 공종자 등]
그런 경우 다수가 <엇비슷한 내용>을 함께 얻어야 할 사정이 없다.
이 경우 <실재 영역의 외부 대상>을 #으로 막연히 표시해보자.
그리고 이를 대하는 <각 주체의 마음>을 A로 표시하자.
그리고 <그 주체가 얻어내는 내용>을 C로 표시하자.
이런 경우 각 주체가 <실재대상>을 대한다.
그리고 제각각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관계는 다음이다.
# + a => C
그런데 <각 주체의 감관>이 엇비슷하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엇비슷하다.
그래서 서로 <엇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얻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 식에서는 <본바탕 내 실재 대상>을 막연히 기호 #로 표시했다.
그러나 <실재대상의 구체적 내용>은 정작 각 주체가 끝내 얻어낼 수 없다.
그래서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한다.
다만 이 표현은 실재에 <전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바탕 실재는 과연 정확히 무언가가 다양하게 논의된다.
실재에 막연히 #를 시설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현실 내용과 일치한 내용>이 실재영역에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현실은 <실답지 않다>고 제시한다.
이 경우 <실답지 않음>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각 주체가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재에서는 얻을 수 없다.
즉 위 경우 C(현실)는 앞의 #(실재)에서 얻을 수 없다.
이런 관계로 현실을 <실답지 않다>고 제시한다.
이는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이 <실답지 않다>고 하는 사정과 같다.
그런데 이런 배경사정과 함께 오직 이런 관계로만 일정하게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하자.
그래서 평소 <외부 상황>이나 <육체로 여기는 부분>이 그대로라고 하자.
그렇다면 외부 <물질>적 조건이 같다.
따라서 갑과 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일정한 조건>에서는 모두 <일정한 내용>을 다 함께 얻어야 한다.
또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감각현실>의 변화과정[물질적 화학적 변화과정]으로 보는 내용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구체적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
현실에 <갑>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의 <육체 상태>는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각 주체의 신체를 해부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몸 내부에 <뇌>가 보일 것이다.
이 역시 <물질>적 육체에 해당한다.
이런 <육체적 조건 상황>은 차이가 없다.
또 <감각을 할 상황>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 한 주체는 매 경우 <일정한 감각>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이>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실의 인식과정>을 관찰한다.
그런 경우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들 내용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 곤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정한 내용>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이는 단순히 이런 <감각현실>의 변화과정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차이는 주로 <수면에서 깨어나는 경계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는 <여러 사람>을 같은 환경에 놓는다.
그리고 <감각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언어>를 통해 보고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입장의 차이를 『수능엄경』에서 다음처럼 구별해 표시한다.
'종소리가 난다'.
'종소리가 들린다'.
<소리를 듣는 과정>을 놓고 이해해보자.
이 과정을 '종소리가 난다'로 이해하는 방식은 <생리학자의 입장>과 같다.
예를 들어 현실에 물리적으로 외부의 종이 울리는 <운동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육체 내 물질>의 <자극 반응관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를 통해서만 어떤 이가 종소리를 듣는다고 하자.
이를 <외부물질>과 <육체>의 <물질적 반응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종을 막대로 때려 <소리>가 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주체는 늘 일정하게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종소리가 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만 울리면 감관을 갖는 이는 모두 <일정한 소리>를 같이 <자극 반응관계>로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오로지 이런 <물질>과 <육체 부분>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그래서 이들 내용을 얻는 과정은 <일반적인 감각현실들의 변화과정> 즉 <물질 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과정>과 동일시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위와 같은 관계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설명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런 감각과정에 작용하는 <별도의 그릇>을 따로 시설해야 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릇>으로서 <마음>이 별도로 있다고 시설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그릇>이 <소리를 듣는 과정>에 개입한다고 보게 된다.
이런 입장을 '종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적인 그릇>으로서의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그릇의 작용과정>도 <일반적인 감각현실들의 변화과정> 즉 <물질 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과정><감각현실의 변화과정>과 동일한 형태로 이해하기 곤란하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K0426, T0945 제4권 )
이들 논의의 결론은 다음이다.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 있다.
이들은 <마음이 얻어낸 내용>이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4.jpg
여기서 현실에서 <감각과정>에 대한 추리 과정을 다음처럼 살펴보자.
철수와 안경사인 자신이 서로 엇비슷함을 관찰한다.
안경사가 <철수가 눈으로 감각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내용을 얻는다고 보고한다..
이 때 <철수가 얻는 내용>은 관찰자인 안경사 자신은 직접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안경사 자신>도 철수가 행한 동작을 행한다.
즉, <안경사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경우 그 내용이 바로 <위 그림과 같은 내용> 전체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함께 합해서 다음처럼 추리하게 된다.
철수가 눈을 뜬다. 이 경우 철수가 <보인다>고 보고한다.
이와 마찬가지형태로 안경사인 자신도 눈을 뜬다.
그 경우 안경사인 자신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각 부분은 <안경사인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 그래서 <외부 실재>에 그런 부분에 상응한 <실재 감관>이 있다고 추리한다.
한편, 1입장에서 <외부 대상으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예: 바위나 산 (4!)]
그런데 철수의 눈이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삼아 대하는 것처럼 관찰된다.
그리고 자신의 눈도 <이와 같은 부분>을 대상으로 삼아 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그래서 외부 실재에 <이런 부분에 상응한 실재 대상>이 있다고 추리한다.
그 상황에서 철수가 <일정 내용>을 얻는다고 보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행한다.
이 경우 자신은 직접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 이 내용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림> 내용 전체다. [예: (5!)]
이 경우 <각 주체가 얻는 내용을 얻어 내는 그릇>을 추리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눈을 뜬다.
이런 경우 철수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철수가 얻는 내용을 담는 <그릇>을 추리한다. [예: (5^)]
한편 자신이 얻는 내용도 사정이 같다.
자신이 <눈을 떠 얻는 내용> 일체를 담는 <그릇>(~정신)을 추리한다.[예: (5!)]
이 경우 <각 주체가 얻는 내용> 안에 그런 그릇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따라서 이런 그릇은 최소한 모두 <각 주체가 얻는 내용> 밖에서 찾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한 주체가 이 그릇을 직접 얻을 방안은 없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한 주체가 얻는 내용>들을 자료로 삼아 추리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반적인 <감각현실들의 변화 과정>을 관찰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감각현실들의 변화과정>은 <물질 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과정> 형태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연달아 쓰러진다. (물리적 변화과정)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타난다. (화학적 변화과정)
그런데 한 주체가 눈은 떠 내용을 얻는 과정을 관찰한다고 하자.
이 경우 그런 감각 과정은 일반적인 <감각현실들의 변화>와 같은 형태로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는 도미노가 단순히 쓰러지는 관계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과정 자체를 <감각현실>과 같은 <물질>적 화학적 변화관계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수능엄경』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형태로 얻는다고 보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이에 관여하는 그릇도 육체적 그릇이 아니라 정신적 그릇(~정신)으로 보게 된다.
이는 그 <그릇> 자체를 한 주체가 직접 얻어내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릇에 얻어지는 현실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현실>을 얻는 <그릇>은 <정신적 성격을 갖는 그릇>(~정신)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신적 그릇>(~정신)을 <마음>이라고 칭한다.
결국 <감각현실>은 <이런 마음> 안에 머문다고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릇(~정신)은 <정신적인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이 그릇(~정신)을 <육체적 기관>으로 보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 가운데 처음 제 1식부터 제8식 까지를 하나하나 <시설>해 나가게 된다.
(참고 ▣-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의 시설 문제)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과 <얻어진 다른 내용>의 공통점
<그릇>(~정신)에 <담겨진 내용>의 성격과 정체를 살피려고 하자.
이는 처음 <감각현실>의 정체를 <색>으로 보는가. <물질>로 보는가의 문제다.
<감각현실>은 다른 <느낌, 관념, 생각, 분별> 등과는 특성 차이가 있다.
<감각현실>은 매순간 생생하다.
또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다.
[ 有見有對色유견유대색)· 有見有對色무견유대색]
또 다수 주체가 일정 시간과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반복해 얻게 된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구분할 의미는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물질>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자.
이는 <물질>이란 표현이 갖는 최소한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모두 <그릇>(~정신)에 담겨지는 내용인 점에서는 같다.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또 <그릇>(~정신)안에 있는 내용인 점도 같다.
물론 각 내용별로 <구체적 그릇>(~정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릇(~정신)에 담겨지는 내용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릇>(~정신)을 <정신>이나 <마음>으로 표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똑같이 <마음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마음> 안에 있고,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
그래서 <마음 안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서로 성격이 같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이들은 모두 <마음 내용>이라고 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정신적 그릇의 작용에 대한 <실재 영역> 추리
현실에서 철수의 <육체>를 본다.
그리고 이런 철수의 몸에 상응한 내용을 <실재영역>에 추리한다고 하자.
또한 <일정한 내용을 얻는 그릇인 마음>을 <육체적 그릇>으로 추리한다고 하자.
이 경우 현실에서 <철수의 육체로 보이는 부분>이 <죽음>으로 소멸된다고 하자.
그러면 역시 사후 철수와 이어지는 <실재 내용>도 시설할 근거가 없다.
그런 경우 철수는 죽음 이후 <철수와 관계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단멸관>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윤회>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그릇>(~정신)을 <정신적인 그릇>으로 추리해 시설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결국 현실내용은 <비물질>적인 내용인 <정신적 그릇>을 바탕으로 얻는다.
즉, <마음>을 바탕으로 얻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윤회과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육체로 보는 부분>과 <육체가 아닌 부분>들의 상호 관계성도 살피게 된다.
그래서 위 부분이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정신과 육체의 관계
평소 일정부분을 자신의 <육체>로 여긴다.
한편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특히 <느낌, 관념, 생각, 분별>을 <정신적 내용>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얻는 <그릇>도 <정신적 그릇>이라고도 여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 <정신>이 <육체>에 종속되는가.
반대로 <육체>가 <정신>에 종속적인가.
아니면 <정신>과 <육체>는 서로 독립적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다음처럼 생각한다.
자신의 <정신>은 <육체>에 종속된다고 여긴다.
우선 육체에 <정신기관>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얻는 <그릇>도 <물질적 - 육체적 그릇>이다.
또 이들 내용을 얻는 과정도 외부<물질>과 육체 내 <물질>의 자극 반응관계로 여긴다.
즉 일반적 <감각현실>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과정>과 마찬가지라고 여긴다.
이런 입장이 <생리학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들 내용이 <잘못>임을 살폈다.
현실에서 자신이 눈을 뜬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육체(물질)>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얻은 내용물>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즉, <자신 밖에 존재하는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들을 <객관적 외부적 실재>라고 잘못 여긴다.
즉, 자신과 철수 영희가 다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들이 곧 자신의 <감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이라고 잘못 여긴다.
또 이들이 동작을 취할 때 <운동기관>이 대하는 <외부 대상>이라고도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들 <각 부분>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들이 <정신>과는 별개로, <정신>과 떨어져 있는, <외부 물질>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그 자신>이나 <외부 세상>이 있을 이치가 없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자신의 감관>이나 <외부 대상>이 있을 이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잘못>이다.
그리고 <이들 일체 내용>은 오히려 <정신적인 그릇>이 얻어낸 <마음 내용>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이 주된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감각현실>의 경우 <다수 주체>가 <일정한 시기>와 <상황>에서 <일정한 관계>로 반복해 얻는다 .
그래서 대단히 <실답게> 이를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배경사정>까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파악한 내용>에 대응한 <실재>를 추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각현실>에 상응하는 <실재>와의 관계도 추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각 내용>을 혼동하면 곤란하다.
먼저, <정신적 그릇에 담기는 현실내용> ( 감각현실, 관념, 분별 등 )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는 <정신적 그릇>,
그리고 그 각각에 상응하는 <실재 영역의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마음>과 <실재>를 서로 혼동하면 곤란하다.
<마음>이나 <실재>나 한 주체가 직접 얻지 못한다.
또 이들은 모두 <현실에서 얻는 내용>의 <본바탕>으로 시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정신적 그릇)은 <현실에서 얻는 내용>을 기초로 그 존재를 추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실재는 이런 <주체와의 관계>를 일체 떠나, <본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을 추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이 다르다.
따라서 <실재>와 <현실 내용>의 경계에 <마음>(정신적 그릇)이 위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내용도 <실재영역>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얻지 못한다.
한 주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만 얻는다.
그리고 <실재>는 어떤 주체도 내용을 직접 얻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는 끝내 <2분법상의 분별>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실재>와 관련된 주장은 어느 쪽으로든 단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들 내용이 <실재>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경우 그 논의는 실효가 없다.
따라서 이들 내용에 대해 <잘못된 집착>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5온>의 분류와 <물질ㆍ정신>의 분류 차이
세계를 상식적인 입장에서 분류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일체를 <물질>과 <정신>으로 나눈다.
한편 <생명체>를 분류할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한다.
즉, <육체>와 <정신>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육체>는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불교의 <5온> 분류는 이와 차이가 있다.
현실 내용을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분류한다고 하자.
이런 분류는 <물질>과 <정신>의 분류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물질>과 <색>이란 각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은 <감각한 현실>로서 같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정체>와 <지위>, <성격>을 달리 파악한다.
그래서 각 <표현이 갖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 내용을 일반적 입장에서 <물질>ㆍ<정신>으로 분류한다고 하자.
여기서 '<물질>'과 '색'이란 표현이 가리키는 부분 자체는 <감각현실>로서 같다.
그런데 <감각현실>을 <물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이 경우 그 <표현>은 다음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느낌,관념,생각,분별 >등을 <정신적 내용>으로 여긴다.
그런데 <감각현실>은 이와 <성격>이 다름을 나타낸다.
한편, 그것은 <정신이 얻어낸 내용>이 아니라고 잘못 여긴다.
즉 본래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것은 '<정신과는 위치상 떨어진 별개의 것>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물질>이란 표현은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의 분류는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경우 <이들 전체>는 눈으로 얻은 <감각현실>이다.
한 주체가 눈으로 얻은 감각내용을 <색>이라 칭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색>이다.
그리고 '색'을 이처럼 <좁은 의미의 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12처>나 <18계>분류에서의 <색>은 이런 의미다.
(안-'색色',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眼耳鼻舌身意 色聲香味觸法)
'<좁은 의미'의 '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음이다.
한 주체가 <눈을 떠 얻어낸 내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색>을 <넓은 의미의 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넓은 의미'의 '색'>은 <감관>을 통해 얻어낸 <감각현실>을 모두 가리킨다.
즉 좁은 의미의 빛깔(色) 소리(聲), 냄새(香), 맛(味), 촉감(觸)을 다 포함한다.
<5온> 분류에서의 색은 <넓은 의미의 색>이다.
즉, <감각내용>을 다 포함한다.
이들 <감각현실>은 <느낌,관념,생각,분별> 등과는 특성이 구분된다.
<감각현실>은 <눈>으로 보거나 <손> 등으로 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 주제>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얻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관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의 <생ㆍ멸 관계>를 <연기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의타기성]
그래서 <감각현실>은 이런 점에서 <느낌,관념,생각,분별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색>은 <수ㆍ상ㆍ행ㆍ식>과 구분해 제시하는 최소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색>은 최소한의 '<물질>'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각현실> 일체는 한 주체가 <각 감관으로 얻어낸 내용>들이다.
즉 각 감관으로 얻은 <감각현실>이다.
그리고 <마음안 내용>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 주체의 외부에 있는 <외부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부에 있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모두 공통한다.
즉, 이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마음이 얻어낸 마음 내용>이다.
한편, 이들 <현실 내용> 전체는 <마음이 얻어낸 결과물>로서 마음내용이다.
따라서 이들은 감관이 대하는 <외부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 안에 있는 <정신 내용물>이다.
그래서 <마음>과 떨어져 있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모두 공통한다.
즉, <감각내용>이나 <느낌ㆍ생각ㆍ행위ㆍ분별내용>이 이런 점들은 다 같다.
결국 <5온>의 분류방식과 <물질>ㆍ<정신>의 분류 방식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Table of Contents
▣○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분류가 갖는 의미차이
<5온>의 분류와 <물질ㆍ 정신> 분류의 <차이>를 간략히 보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전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자신이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다.
이 때 <어떤 내용>을 얻게 된다.
이 때 자신이 <무엇>을 대해 <그런 내용>을 얻었는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다음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우선 눈앞에 <책상, 그릇(~정신) >이런 것이 있다고 나열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것>을 대해 <그 모습>을 얻었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얻어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또 <그 나머지>를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를 모든 이가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를 <실재의 자신>과 <실재의 외부대상>으로도 잘못 여긴다.
또 자신이 만지는 눈이나 귀 등을 <실재의 감관>으로 잘못 여긴다.
또 동작을 취할시 동작을 취하는 <운동기관>과 <그 외부대상>으로도 잘못 여긴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기본 범주는 이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위와 같은 <의미>와 <지위>로 이해하면 <잘못>이다.
여하튼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은 곧 <현실 일체의 요소>로 제시된다.
그래서 <세계>와 <자신>의 기본 분류 범주로 된다.
결국 <모든 현상의 일체 내용>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5요소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나열하여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곧 <현실 세계 일체>를 나열해 살피는 것이 된다.
일체를 나누는 방법에는 이외에도 <6대>, <12처>, <18계>와 같은 방식도 있다.
그런데 <5온>을 가장 먼저 제시해 살핀다고 하자.
현실에서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 주체는 <각 단계별>로 얻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
즉 한 주체는 먼저 <감각>하여 색을 얻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느낌>을 일으킨다.[수]
그리고 이에 바탕해 <관념>을 일으켜 얻는다.[상]
그리고 <생각,말,글, 행위,태도,자세>를 취한다.
이는 결국 <의업, 구업, 신업>에 해당한다. [행]
그리고 다른 내용과 대비한 가운데 그 의미에 대해 <뚜렷한 분별>을 일으킨다.[식]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얻는 <일체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현실에서 얻는 일체의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분류해 그 내용을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한 주체가 얻는 <현실 내용 일체>가 이에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일체를 이 <범주> 안에 포함시켜 살필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실에서 각 주체는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가장 <집착>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살피는 데 있어서도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분류가 기본적이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한 주체가 얻는 내용 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범주 가운데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기본적으로 살핀다.
한편 현실 현상의 내용을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제시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런 현실 내용을 얻게 하는 <기본바탕>을 추리할 수 있다.
즉 한 주체와 관계없이 <본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 무언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실재대상>과 <실재주체>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곧 <실재의 공함>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한 실재]
한편, 이런 현실 안에 그런 현실을 나타나게 하는 <참된 뼈대>가 들어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현실내용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본체>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비아, 무아, 무자성]
그래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사정으로 경전에서 <기본적인 판단>이 여러 측면으로 제시된다.
즉,
1. 그 <현상적인 모습>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
1. 그 <가치>적인 측면은 일체의 생멸하는 현실이 모두 <고통>과 관련된다. [고]
1. 그 <실재>의 내용은 얻을 수 없어 공하다. [공]
1. 그것은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참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아, 무아, 무자성]
*pt* 끝 to k0020sf--♠○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오온에 대하여
[반복]
>>>
♥Table of Contents
▣● 일체를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보는 근거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은 <현실내용 일체>를 뜻한다.
그런데 다시 이들은 모두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일체가 그와 같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들 내용이 왜 <바른 관찰>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경전에서는 짧게 <그 결론>만 제시된다.
그리고 그 <의미>와 <근거>는 자세히 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반복끝]
♥Table of Contents
▣- <일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진리 (5법인)의 성격
현실내용 일체를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임을 제시한다.
이는 각각 이들 <일체>에 관해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판단이다.
즉, 이는 그 <현상>적인 측면,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그 <실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영원불변한 본체>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다.
한편 이에 <열반적정>도 그와 같은 기본적 판단의 하나가 된다. [5법인]
이들 내용은 <일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성립한다.
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실상론, 연기론, 수행론>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는 곧 <세계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실상론],
또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연기론],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하고
또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수행론]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위 내용은 결국 <실상론>에 속하는 부분이다.
『잡아함경』 첫 부분에 이들 내용이 간단히 제시된다.
즉, 일체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다.
그러나 이 명제가 갖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다.
불교의 많은 논서들이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전개한다.
그래서 별도의 경전과 논서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살피기는 곤란하다.
♥Table of Contents
▣- <망집에 바탕한 희망>과 일치하지 않는 5법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은 현실에서 <참>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을 희망한다.
그래서 그런 <희망에 맞는 주장>이 제시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주장>을 믿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입장>으로 제시된 내용은 아니다.
위 내용들은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사실>에 대해 올바로 판단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내용>이 이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되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애착>하고 <집착>한다.
그런 경우 대부분 그런 내용이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란다.
또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는 상태에 있다.
그런 경우 세상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무시할만하다고 여긴다.
또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하자.
그래도 자신은 <그런 상태>에 처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삶은 대체로 <즐거움>이라고 여긴다.
또 자신에게는 <참된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본체>가 있다고 여긴다.
또 본바탕 <실재 내용>은 <현실내용>과 일치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현실은 <실답다>고 여긴다.
그런데 <부처님이 제시하는 내용>은 <이런 희망>과 일치하지 않는다.
♥Table of Contents
▣- <권위적 판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
한편, 이들 내용에 대해 다음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자신은 <부처님>을 신뢰한다.
그런 <부처님>이 이런 내용을 그처럼 제시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내용을 그저 믿고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는 부처님의 판단에 권위를 인정하고 무즈건 따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렇게 진리를 판단하는 입장을 성언량( 聖言量)이라고 칭한다.
♥Table of Contents
▣- <합리적 판단>에 의한 이해
다만 이들 내용은 모두 엄격하게 그 내용의 <참>을 모두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어떤 내용이 옳은가를 <스스로> 깨달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내용을 <옳다고 하는 근거나 사정>을 묻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근거>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 각 명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들을 옳다고 제시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이 된다.
여기서는 이를 간단하게 살피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되는 부분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현상 일체가 <영원하지 않다>고 제시하는 근거
<현실내용 일체>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일체는 <자신이 관계하여 얻는 내용>이다.
즉 <자신>이 관계하면 얻는다.
그러나 그 <관계>를 떠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사라지고 <얻지 못한다>.
<현실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도 마찬가지다.
<자신>과의 관계를 떠나면 이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한 주체가 <생사현실 내 모든 내용>을 한 순간에 다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 일체>는 모두 <영원하지 않다>.
이런 사실은< 다음 방식>으로 간단히 밝힐 수 있다.
어떤 주체가 어느 한 순간 <현실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그 관계>를 떠난다.
그러면 <그렇게 얻은 내용>이 사라진다.
이런 사실을 경험한다.
지금 현재 순간에 얻는 <일체 내용>이 그와 같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일체>는 다음에 해당한다.
우선 나머지들은 언젠가 <나타났다>거나 <나타날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없다>.
따라서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즉 <무상하다> .
또한 현재 얻어진 <현실일체>는 <자신>과의 관계를 떠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사라짐>을 확인한다.
그런데 <과거에 얻은 내용>도 사정이 그와 같다.
그리고다음 <미래에 얻을 내용>도 사정이 이와 같다.
그래서 <현실 일체>는 다 <그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즉 <무상하다> .
따라서 <현실 일체>가 <무상함>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일체>에 대해 <집착>을 갖고 대하지 않아야 한다.
○ 일체를 <고통>이라고 제시하는 근거
경전에서 일체를 다 <고통>이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 다음처럼 여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
그리고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일체를 다 <고통>이라고 함에 대해 의문을 갖기 쉽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우선, 불교의 목적은 <생사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깊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일체의 현상>이 모두 이런 <생사고통과 관련됨>을 파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에는 <좋음>과 <나쁨>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실의 일체 내용을 다음처럼 4분해 나눠볼 수 있다.
- 나쁜 것[괴로움]
- 좋은 것[즐거움]
-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것[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인 경우]
-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것]
이처럼 나눠볼 수 있다.
그런 경우 이들 각 부분에서 결국 <나쁜 것>이 문제된다.
그래서 삶에서 이 <나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사현실 내 <생사고통>은 연기관계로 발생한다.
즉, <망집 번뇌> - <업> - <생사고통>의 관계로 발생한다. (혹-업-고)
그래서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원인단계>에서 <원인>을 제거해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업>을 중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고통>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수행은 <이런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고통>을 기준으로 <일체 현상>을 살핀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한 경우 현실 일체가 모두 이 <괴로움>과 <관련됨>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 일체는 모두 <고통>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일체개고]
불교의 <4성제>가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고제-고집제-고멸제-고멸도제]
<일체현상>은 다음과 같이 모두 고통과 관련된다.
우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따라서 괴로움이다. [고고苦苦]
한편, <좋은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진다>.
따라서 <고통>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통으로 본다. [괴고壞苦]
그리고 그 외 것도 그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주게 된다. [행고行苦]
그래서 <일체 현상>은 이처럼 <괴로움>과 관련된다.
따라서 <일체 현상>이 이런 괴로움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함>이 수행 목표가 된다.
그 방안을 지금 <경전>에서 제시한다.
<심해탈>의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전 안에서 이어 제시하는 여러 <수행방안>들이다. [고멸제-고멸도제]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자.
이런 상태를 <심해탈>ㆍ<혜해탈>ㆍ<열반> 등으로 표현한다.
일시적인 것이더라도 <좋음>을 준다고 여겨지는 상태가 있다.
세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를 추구한다.
생멸하는 <일체 현상>은 일시적으로 <좋음>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긴긴 <고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불완전한 좋음>이다.
따라서 이는 삶에서 해결할 <문제현상>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고통>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은 이런 상태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세속의 <일반적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를 살핀다.
그런 가운데 <망집>에 바탕해 얻게 되는 <현실내용 일체>를 <고통>으로 관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 일체>에 대해 <집착>을 갖고 대하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일체의 본바탕 실재
<실재>는 일체 현상의 <본바탕>을 의미한다.
이런 본바탕 <실재>가 문제되는 사정을 살펴보자.
자신이 눈을 떠 어떤 <꽃>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그런데 자신이 <눈>을 감으면 이제 그 꽃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자신이 직전에 본 <꽃>이 그 순간 아주 사라져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관계 없이> <꽃>은 꽃대로 그대로 있다고 해야 하는가.
즉 자신이 꽃의 모습을 <보던> 또는 <보지 않던> 관계없이, <꽃>은 그대로 있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과 관계없이> 무언가가 그대로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곧 본바탕 <실재>에 대한 문제다.
어떤 이가 <꽃>을 보았다고 하자.
그런데 자신이 그 꽃모습을 <보던> <보지 않던> 간에, 있다고 할 꽃 <그대로의 그 실재모습>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을 떴을 때 얻은 내용>과 같은가.
아니면 <자신이 눈을 감을 때 대한 내용>과 같은가.
이런 의문이다.
♥Table of Contents
▣- <현실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본바탕 <실재>의 문제
현실에서 어떤 이가 <눈>을 떠 <어떤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이렇게 <눈을 떠 얻는 일체 내용>을 <좁은 의미의 색>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색의 <일부분>을 취해 <자신>이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또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이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또 이런 색을 그런 색을 얻게 한 <외부대상>이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또한 이런 색을 <정신과 별개로 떨어진 내용>이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색'은 각 주체가 <얻어낸 내용>이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감각내용>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살핀다면 한 주체의 <마음>으로 얻는 <마음 내용>이다.
이렇게 <현실에서 얻는 내용>의 <정체>를 먼저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에 대해 갖는 이해는 잘못이다.
그래서 이는 <자신>이나 <외부 세상>이 아니다.
또 그런 색은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또한 자신이 대한 <외부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정신과 별개로 떨어진> 외부의 '<물질>'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이 <눈으로 얻은 색>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처음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 잘못 이해했던 내용>들이 있다.
그런 경우 <이런 이해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신 무엇들인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한 주체는 <감각현실> 이외로도 현실에서 <수ㆍ상ㆍ행ㆍ식> 내용도 얻는다.
그런데 이들 <현실내용> 일체도 사정이 이와 같다.
이들은 모두 그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다음 내용들이 다 함께 문제된다.
즉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 있는 '진정한 자신'은 무엇인가.
또 <자신이 얻어낸 내용> 밖에 있을 '외부 세상'은 무엇인가.
또 진정한 '<외부의 객관적 실재>'는 무엇인가.
또 자신의 <실재 감관>은 무엇인가.
또 자신의 감관이나 운동기관이 대한 '<외부 대상>'은 무엇인가.
또 자신의 '<마음 밖에 있다고 할 내용>'들은 무엇인가.
또 <이런 현실 내용 일체를 얻는 그릇과 같은 것>을 '<마음>'이라고 하자.
이런 마음의 '<실재>'는 또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살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과 관계없이> 있다고 할 <실재내용>을 생각한다고 하자.
<현실 일체>는 자신이 <관계>해 <얻어낸 내용>이다.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실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자신이 <꽃의 모습>[색]을 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런 색을 얻게 하는 <실재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즉, 이 경우 <실재>와 관련해 이 문제를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다음과 같이 추리하게 된다.
즉 자신이 눈을 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이 경우 이처럼 자신이 얻은 내용과 별개로 <실재의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실재의 자신>이 <이런 내용>을 얻어낸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얻는데 관계하는 <실재의 눈>(감각기관)이 있다.
그리고 이 감관이 다시 실재하는 무언가를 <대상>으로 관계한다.
그런 결과 현실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그런 <꽃모습>[색]을 화합해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추리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 <실재내용>들은 무엇인가?
즉 <실재의 대상>이나 <실재의 감관>은 무엇인가.
그런데 각 주체는 매 순간 <자신이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다.
각 주체는 그 주체의 <감각기관>, <인식기관>이 관계해 화합해 얻는 내용만 얻는 것뿐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 삼는 <실재>는 자신과 관계없이도 있다고 할 내용이다.
그래서 그 <실재 내용>은 그런 주체로서는 끝내 직접 얻을 수 없다. [불가득(不可得) ]
각 주체는 <자신이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는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등의 온갖 <2분법상의 분별>을 떠난다. [불이법]
그리고 <어떤 언설>로 끝내 표현할 수 없다. [언어도단]
그래서 <평소 어떤 의미를 별로 갖지 않는> <공(空)이란 표현>을 빌려 <공>이라고 표현한다.
♥Table of Contents
▣- 실재내용과 감각내용의 관계
실재와 <감각현실>과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실재와의 관계-4.jpg
자신이 <눈>을 뜬다.
이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위 그림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이들 전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따라서 <자신과 관계없이>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실재내용>이 아니다.
<실재 대상>이 아니다.
<실재 주관>도 아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 철수가 <보는 과정>을 관찰한다. [예 (2!)]
이 때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래서 이를 관찰한 <자신>은 이렇게 추리한다.
자신은 <철수가 얻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철수가 보인다고 보고하거나 않거나, <자신 입장>에서는 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수가 얻는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런 내용>은 <철수의 영역>에 존재할 것으로 추리한다. [예 (5^)]
즉, 그래서 <철수의 머리>(정신영역) 안에 <그 내용>들이 위치할 것으로 추리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리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자신이 <눈>을 뜬다.
이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으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로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다른 사람> 철수나 영희가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따라서 위 판단은 <잘못>인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상식적 내용>을 통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철수가 눈을 떠 감각하는 <감각현실>이 있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산>을 본다고 하자. [예 (4!)]
그런데 이 상황에서 <철수>가 그런 산을 본다고 <보고>한다고 하자.
그 경우 철수도 역시 그의 마음에서 <자신이 본 것과 비슷한 내용>을 얻으리라 추리한다. [예 (4^)]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철수가 얻는 감각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은 여하튼 그 산의 <실재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철수가 <눈>을 뜬다.
그래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러면 그와 별개로 <그런 내용을 얻게 한 내용>이 철수 <외부>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철수가 눈을 감으면 <산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보고한다.
그 때 그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은 <철수가 얻는 내용>이다.
이는 철수의 마음으로 <철수가 얻는 감각내용>이다. [예 (3^)]
그런데 <이 과정>을 <자신>이 관찰한다고 하자.
이 경우 <자신>이 <철수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철수>나 <그 외부 내용>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
따라서 <이들 부분>이 사라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따라서 <철수가 눈을 떠 보게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자.
이는 <철수 내부 안에서의 변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철수 밖의 내용>과 <철수의 눈>이 관계하여 얻는다고 이해하게 된다. [예 (3!) 와 (2!)의 관계]
그리고 이런 이해는 다음과는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스스로 다음처럼 생각한다고 하자.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철수가 스스로 <철수자신>으로 여긴다. [예 (2^)]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철수가 <철수 자신이 대하는 외부대상>으로 여긴다. [예 (4^)]
그리고 이를 <철수 자신의 눈>이 관계한다고 여긴다. [예 (2^)의 일부분]
그런 가운데 철수가 <그런 내용>을 얻는다고 여긴다. [예 (4^)]
이는 물론 <잘못된 생각>이다.
이들은 모두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이처럼 <철수가 얻어낸 내용> 안에 <철수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또 <외부대상>이나 <철수의 감관>이 들어 있을 이치도 없다.
그러나 철수가 여하튼 이처럼 이해한다고 하자.
철수가 <어떤 감각내용>(현실)을 얻게 된다.
그런 경우 <그런 감각내용>을 얻게 한 <대상>과 <주체>를 추리한다.
즉, <실재대상>을 추리한다.
그리고 <실재 주체의 감각기관>을 추리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감각내용>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추리한다.
그래서 <이를 관찰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를 다음처럼 추리한다.
<철수의 마음> 밖에 있는 <실재의 대상>이 있다.
그리고 <실재의 주체의 감각기관>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관계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철수는 <철수의 마음>에서 <어떤 내용>을 얻는다.
이는 <철수 부분> 안에 위치한다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자신은 다시 다음처럼 <잘못> 이해하기 쉽다.
즉 철수 밖의 <외부 실재 대상>과 <감관>에 대해 다시 다음처럼 잘못 이해하기 쉽다.
철수가 눈을 뜨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보고한다.
이 경우 그런 내용을 얻게 한 <실재의 주체>가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 있다.
그런 경우 그러한 <실재적 주체로서 철수>는 곧 <자신이 철수로 여기고 대하는 부분>이라고 잘못 여기기 쉽다.
또 <철수가 대한 실재대상>이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 있다.
그래서 <철수가 대한 실재대상>은 또 <자신이 바라보는 내용들>이라고 잘못 여기기 쉽다.
그것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모두 <철수가 얻어낸 내용> 밖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들 내용은 모두< 1자신이 얻어낸 감각현실>이다.
또 <1 자신이 얻은 내용> 안에 <다른 사람> 철수가 들어 있을 이치는 없다.
또한 <1자신이 얻은 내용>을 <다른 사람 >철수가 대상으로 삼아 무언가를 얻는 일은 없다.
그러나 여하튼 <철수>에 대해 일단 위와 같이 추리했다고 하자.
이 경우 <다른 사람> 철수가 얻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은 무엇인가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감각과정>을 생각해보자.
자신 역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한다.
그런 가운데 <나타나고 사라지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 (5!)]
자신이 <감각현실로 얻는 내용 전체>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얻는 내용>은 자신의 마음 안의 <감각현실>이다.
그런 경우 <이런 내용>을 얻게 한 <외부의 실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철수의 감각과정>을 놓고 이 문제를 생각해본다고 하자.
<다른 사람> 철수의 감각과정을 관찰했다.
이 경우 철수가 스스로 <감각하는 과정>을 일정하게 추리한다.
이를 앞에서 살폈다.
그러나 이런 추리는 기본적으로 <오류>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철수>가 다음같이 추리한다고 하자.
철수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철수>는 다시 <일정부분>을 <다른 사람> 1로 여긴다. [예(1^)]
그리고 <일정부분>을 <외부 사물>로 여긴다. [예 (4^)]
그런 가운데 이들 각 부분이 서로 관계한다고 이해한다고 하자. [(1^)~(4^)]
그런 가운데 <1이 얻는 내용>이 <1안>에 위치한다고 여긴다. [예(1^)안의 내부 ]
이렇게 <철수>가 <다른 사람 1의 감각과정>을 이해한다고 하자.
이런 내용을 1 입장에서 1 자신이 검토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철수의 이런 이해>가 잘못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내용 일체는 <철수가 얻어낸 내용>이다.
그처럼 <철수가 얻은 내용> 안에 <1 자신>이 들어 있을 이치가 없다.
또 <철수가 얻은 내용>을 <1 자신>이 <대상>으로 삼아 어떤 내용을 얻을 이치가 없다.
그래서 <철수가 행하는 이런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1 자신이 다른 사람에 행하는 판단>도 이와 형태가 같다.
따라서 <1 자신의 추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임을 이해해야 한다.
즉 자신이 <철수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또 <철수가 대한 외부세상>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자신이 얻어낸 내용> 안에 <다른 사람> 철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수의 '실재주체'>가 아니다.
또 <자신이 얻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대상>으로 삼아 감각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수가 대한 외부 '실재대상'>도 아니다.
결국 이들은 철수가 감각 내용을 얻을 때 <서로 관계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자신 입장에서 <그렇게 잘못 여겨지게 되는 내용>일 뿐이다.
<철수가 감각을 통해 얻어낸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자신이 얻어낸 내용> 일부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다. [예 (2^)]
그래서 앞에서 행한 추리는 모두 <잘못된 판단>이다.
결국 각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
이에 관계하는 <실재의 주체>와 <외부대상>을 찾는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들은 모두 <각 주체가 얻는 내용>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
즉 <실재주체>와 <실재대상>은 <각 주체가 얻는 내용>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실재를 찾는 문제
자신이 <눈>을 뜬다.
이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 (5!)]
그런데 이들 내용은 자신과 관계없이도 있다고 할 그런 <실재내용>이 아니다.
이제 이런 <감각현실>을 얻게 한 <실재내용>을 찾는다고 하자.
이 경우 실재는 <각 주체가 얻는 내용>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그림을 놓고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056 ☞○ 마음과 색의 의미에 관한 논의
☞○ 진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착각
03fl--ghpt/r1030.htm
[img2] [그림] 08pfl--image/진리의오류55-실재와의 관계-4.jpg
♥Table of Contents
▣○ <감각현실>과 <실재내용>의 관계
*pt* 시작 to k0020sf-- ♠○ <오온>의 <공>함의 의미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그런 내용>을 얻게 한 <실재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 대부분 상식적으로 다음처럼 잘못 이해한다.
어떤 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신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를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즉 자신 뿐 아니라 <영희> <철수>가 함께 대하는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감관이 대한 <외부 대상>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자신의 마음>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외부 물질>로 잘못 여긴다.
그런데 이제 이들 내용이 <자신이 얻어낸 내용>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래서 앞과 같은 판단이 <잘못>임을 이해한다.
이 경우 다시 그런 내용을 얻게 한 그 <외부의 실재내용>이 무언가를 추리한다.
이 경우 각 주체별로 <각 주체가 얻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 <실재>는 <각 주체가 얻는 내용>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
한 주체가 <어떤 내용을 얻는다.
이 때 그것을 얻게 한 <실재내용>이 문제된다.
이 경우 그 <실재>는 자신이 얻은 내용과 <똑같이 일치할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또는 적어도 그와 <비슷한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추리할 수도 있다.
또는 이에 <비례하는 그 무엇>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추리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증거나 자료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
어떤 주체도 이런 <실재내용>을 직접 얻어낼 수 없다.
경전에서는 다음처럼 제시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즉 <3세제불>도 실재를 직접 얻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주체는 자신이 <관계해 얻는 내용>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실재>는 어떤 주체와 <관계>를 떠나 본래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각 주체는 이런 <실재>를 끝내 얻을 수 없다. [불가득 不可得]
따라서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일체의 분별 판단>을 행할 수 없다.
또 적어도 이와 비례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등의 <일체의 판단>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실재를 현실내용과 <일치>한다거나 <유사>한 것으로 추리한다고 하자.
이러한 추리는 현실 안에서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우선 위 그림을 살펴보자.
철수라는 이가 <눈>을 통해 <바위의 모습>을 얻는다고 가정하자. [예 (4^)]
이 경우 철수는 그것을 얻게 한 <실재 내용>도 그와 같으리라고 추리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제 철수가 <손>으로 대하여 만진다.
이 경우는 바위에 대한 '<촉감>'을 얻게 된다.
이제 또 이 경우 그 실재는 그 '<촉감>'과 같다고 추리해야 한다.
즉, <손>으로 <촉감>을 얻는다고 하자.
그 경우 <그 실재내용>도 역시 <그런 촉감>이라고 하게 된다.
이 경우 <그런 촉감>이 자신과 관계하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실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각 감각기관>을 관련시킨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매 경우 이처럼 <서로 차원이 다른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런 각 감각내용을 얻을 때마다 <실재내용>도 그와 같다고 추리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서로 간에 잘못된 판단>이 된다.
<실재내용>이 자신이 감각한 <바위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촉감>은 그런 바위 모습(색)인 <실재>를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촉각>은 <엉뚱한 내용>을 잘못 얻는 것이 된다.
반대로 이제 <촉감>을 <그 실재내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눈>으로 본 모습은 <그런 촉감인 실재>를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각>은 <엉뚱한 내용>을 잘못 얻는 것이 된다.
한편, <촉감 영역>에서는 <무언가 있다고 여기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각>의 감각영역에서는 아예 <아무 내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도 전혀 <엉뚱>하게 다르다.
이처럼 <눈>으로 본 <시각적 감각내용>과 <촉감>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서로 <엉뚱한 내용>이다.
결국 이런 추리는 현실 내 <각 감각 영역> 사이에서도 <일치>나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넘어 <각 감각내용>을 그대로 <실재의 영역>에 밀어 넣는다고 하자.
그래서 <각 감각현실과 각기 일치한 내용>이 <실재영역>에 모두 다함께 모여 있다고 추리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이를 바탕으로 얻어낸 <감각현실 상호간>에는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추리는 <근거>가 없고 지나치다.
한편 이런 추리는 다음 문제도 갖는다.
어떤 <물체의 모습>을 본다고 하자.
이에 대해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다음처럼 추리한다.
우선 <그 물체>가 우리에게 <그런 파장의 빛>을 반사시킨다.
그리고 그 파장을 <신경>이 반응한다.
그래서 <뇌 영역> 안에 그런 모습을 비추인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놓고 <이 관계>를 추리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사과의 붉은 모습>을 본다고 하자.
이 경우 정작 +사과의 실재내용>은 붉은 모습은 아니다.
단지 <붉은 빛 파장을 반사시킨 그 무엇>일 뿐이다.
이 경우 다음 <각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붉은 빛 파장을 <반사시킨 물체>
- <반사된 붉은 빛의 파장>
- 이로 인해 흥분한 <시신경의 상태>
- 이 신경의 자극을 전달받은 <뇌세포>
그리고 <이 각각>은 서로 <일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추리는 <한계>가 있다.
한편 <실재내용>이 <이런 감각내용들>을 <하나로 다 함께 모아 놓은 것>이라고 추리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현실의 <각 감각내용>은 다 함께 <엉뚱한 관계>가 된다.
이 경우 <각 감각>은 적어도 실재내용 가운데 <일부분>은 일치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각기 다 <불완전>하고 <엉뚱>한 관계가 된다.
실재내용과 <감각현실>(시각적 내용)의 관계를 살폈다.
그러나 이는 <감각현실>과 <실재내용>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다.
<관념내용>과 <실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관념내용>은 <감각현실>을 다시 바탕으로 하여 마음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실재>와 <관념내용>은 더욱 거리가 멀다.
한편 이런 추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이다.
한 주체는 자신이 관계해 <얻어낸 내용>만 얻는다.
따라서 어떤 주체도 <실재>를 단 한 부분도 직접 얻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추리에 대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근거>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주장도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실재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그 <실재 내용>은 어떤 주체도 직접 얻어낼 수 없다. [불가득 不可得]
그래서 <실재내용>은 결국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을 떠난다. [불이(不二)법]
따라서 무엇이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다, -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없다.
또 같다, 다르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재는 이런 <분별>을 모두 떠난다.
그리고 끝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사정으로 <실재>를 <표현>해 가리키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평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공>'이라는 표현을 빌린다.
그리고 '<공>하다'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어떤 내용과 성질 형태로 적극적으로 있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일체의 <실재>는 모두 <공>하다고 표현하게 된다. [일체개공]
본바탕 <실재>는 그 내용을 얻지 못하고 <공>하다.
그런데 <현실>은 각 주체가 일정하게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는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의 각 내용>은 서로 그 <지위>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현실>은 마치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현실 일체>에 대해 <집착>을 갖고 대하지 않아야 한다.
*pt* 끝 to k0020sf-- ♠○ 오온의 공함의 의미
<<<<<
♥Table of Contents
▣○ 비아, 또는 무아, 무자성 판단 문제
여기서 <아>(我)는 그 연역상, '참된 진짜의 <실체>로서의 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곧 <영원불변한 실체로서의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현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나>가 있다.
이는 <참된 진짜>의 나, <영원불변>한 나의 <본체>가 아니다.
<현실의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던 매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파악된다.
그것과 관계하는 <주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바위> 하나를 자신이 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자신이 <아침에 볼 경우>와 <저녁에 볼 경우> 모습은 다르다.
<가까이 다가서 본 모습>과 <멀리서 본 모습>이 또 다르다.
또 <색안경을 쓰고 보는 모습>이 다르다.
그리고 <안경을 벗고 보는 모습>이 다르다.
또한 <눈으로 대하는 내용>이 다르다.
<귀>나 <코>, <혀>, 손과 발과 같은 <몸>으로 대하는 내용이 다르다.
<현실에서 얻는 내용>이 있다.
이는 매순간 다 다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변화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진짜의 내용>이라고 하기 곤란하다.
또 <어느 하나>를 이들 모두의 <대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현실 내용>은 하나같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게 된다.
<현실 내용>이 이처럼 매번 대할 때마다 다르다.
그러나 또 한편 <현실 모습>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바위>를 대한다고 하자.
물론 엄밀히 헤아리면, <얻는 내용>은 매번 다르다.
그래도 바위는 바위로서 <일정한 형체>나 <골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실의 <여러 현상>은 <진짜>가 아니다.
<일시적>이고 <변화>하며 <꿈처럼 실답지 않은> 내용이다.
그럼에도 <각 현실내용>은 일정한 <골격>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그 안에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본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추리하게 된다.
즉 <본체>가 있기에 현실이 그처럼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추리한다.
이런 입장에서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본체>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추리대로 정말 그런 <실체>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불교의 <무아, 무자성>의 내용이다.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본체>의 존부를 문제 삼는다고 하자.
이는 <참된 진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현실은 모두 <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 얻는다.
<각 현실 내용>은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 그처럼 얻는다.
이런 <조건>과 <상황>을 떠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내용은 <변화>되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떠나 <다른 관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얻지 못한다.
또한 <현실 내용>은 <다른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현실내용>은 <참된 진짜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현실 일체>는 모두 <꿈>과 그 <성격>이 같다.
그래서 <꿈>처럼 <실답지 않다>고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참된 진짜>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
<꿈>을 꾸는 동안은 <꿈>을 생생하게 꾼다.
그래서 꿈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꿈은 <꿈을 꾸는 조건과 상황>에서만 <그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꿈을 깨면 <그 내용>은 사라진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현실 영역>에서 얻지 못한다.
또한 그런 <꿈>은 <그로부터 기대되는 다른 내용>들을 현실에서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집에 <금>이 묻혀 있는 것을 꾸었다.
그래도 꿈을 깨면 그 <꿈 내용>은 사라진다.
꿈에서 본<금>이나 <그 금이 묻힌 장소>를 <현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꿈>의 내용은 <진실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다.
<현실내용>은 <이를 얻는 조건과 관계>에서만 <그런 내용>을 얻는 것이다.
꿈과 현실 사이에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변화>한다.
또 그 관계를 떠나면 <다른 관계>에서는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현실 내용>은 우선 <실재의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또한 예를 들어 자신이 <눈으로 얻는 색깔>은 <귀>의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반대로 <귀로 얻는 소리>는 <눈>의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이처럼 <현실에서 얻는 내용>은 <그것을 얻는 관계>에서만 얻는다.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는 얻지 못한다.
<그것을 얻는 관계>를 떠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강물에 비친 달 모습>이 <진짜 달>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달에서 기대되는 다른 내용>을 얻을 수 없다.
강물을 떠나서는 그것은 얻지 못한다.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달그림자는 <진짜 달>이 아니다.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실에서 얻는 내용>(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모두 <꿈>과 그 성격이같다.
또한 <환영>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다.
<현실내용>은 모든 이와 같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갓난아이>의 모습이다.
그런데 <청년>의 모습 그리고 <노인>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변화>한다.
이런 <수많은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참된 진짜의 모습>인가.
이런 질문도 이와 관련된다.
<현실 현상>은 그렇다.
그런데 이런 <현실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진짜의 내용>을 생각한다고 하자.
즉<영원불변한 본체>는 이런 현실에 <존재>하는가가 문제된다.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것>을 <진짜의 내용>이라 관념한다.
그리고 이를 찾는다.
이는 그것을 정말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얻는 현상적 내용(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모두 <꿈>과 <환영>과 같다.
그래서 <그 관계>를 떠나면 사라지고 변화한다.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거짓>이라고 보게 된다.
따라서 이와는 반대로 <꿈과 성격이 다른 것>을 찾는다.
즉, <영원>히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내용>을 <진짜>라고 관념하고 <그것>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무아, 무자성>의 판단이다.
<무아, 무자성>을 밝히는 방법은 다음이다.
관념으로 <진짜의 관념>을 <영원불변한 본체>라고 정한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그렇게 정한 <관념의 내용>이 <현실 내용>과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무아ㆍ무자성>을 밝힐 수 있다.
즉,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런 경우 오히려 <현실의 모습>은 얻을 수 없다.
이런 <모순관계>를 밝힌다.
따라서 그 <부존재>를 밝힌다.
이 <추론과정>은 이미 앞에서 살폈다.
(참고 ▣- 실체의 유무 문제 )
<영원불변한 본체>는 그렇게 <관념>으로 정해 찾는다.
그러나 <그런 관념에 해당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실체>나 <본체>는 단지 <관념>으로 그처럼 주장될 뿐이다.
따라서 <현실 내용>은 <실체>가 없다.
따라서 <꿈>처럼 <실답지 않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현실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논의의 실익 문제
한편, 이런 논의와 관계없이 <현실>은 <변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참된 진짜>가 변화하지 않고 <영원불변>하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진짜는 현실과 <관련>될 수 없다.
각 주체는 현실에서 <변화>한다.
또 이런 주체는 변화를 통해 <현실 내용>을 얻는다.
결국 <영원불변한 내용>은 이런 <주체 >와 관련될 수 없다.
이 <영원불변한 본체>를 설령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현실의 존재>에게 어떤 <실익>도 없다.
<현실에서 얻는 내용>이 그런 영원불변한 본체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내용>이 아니다.
또 <영원불변한 본체>가 현실 내용 안팎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무아, 무자성>은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어떤 진짜인 영원불변한 <본체>가 없다.
따라서 현실 내용은 이런 진짜와 상대하여 <가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내용은 현실내용대로 <진짜에 요구되는 여러 성질>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역시 <진짜>가 아니라고 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실체 없음>과 실재의 <공함>의 관계
<실체 없음>은 실재가 <공>하다는 판단과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주관과 관계없이 실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핀다고 하자.
이런 경우 만일 <영원불변한 본체>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런 영원불변한 본체>를 <그런 실재의 내용>으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불변한 본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재의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
그리고 8<그 실재의 내용>은 직접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실재>는 <공>하다고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공>은 우선 <실재의 내용>을 <얻을 수 없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영원불변한 본체>가 <없음>도 함께 나타낸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관계되는 곳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판단>에 대해 간략하게 살피고 마친다.
이제 <다음의 의문>을 살피기로 하자.
[반복]
>>>
♥Table of Contents
▣● <무상ㆍ고ㆍ공ㆍ비아>를 근거로 싫어하여 떠날 이유
한편, <현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모두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런 경우 다시 <다음 의문>을 갖게 되기 쉽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는가.
또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가. [염리厭離, 희탐진喜貪盡]
한편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반드시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그에 대해 <싫어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들이 <무상ㆍ고ㆍ공ㆍ비아>임을 관한다,
그런 경우 그처럼, <싫어하여 떠나는 일>이 잘 <성취>되는가.
또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상태>[염리, 희탐진]가 잘 <성취>되는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다.
경전에서는 <다음>처럼 제시한다.
"색(色)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
괴로움, 공, 나가 아님도 같다.
이렇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니라.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고 하자.
그러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심해탈>(心解脫)이라 하느니라.
...
그런데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관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로 인해 <싫어할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다고 이로 인해 곧바로 현실을 <싫어할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현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성>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우선 음식을 <영원하다>고 여겨 좋아한 경우는 드물다.
또 <아름다운 이성>이 영원하리라 여겨 좋아하는 경우도 드물다.
한편 이제 이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사정이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드물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임>을 잘 이해한다.
또 어떤 것이 <한 순간밖에 얻을 수 없음>도 잘 이해한다.
즉 이들 일체가 <덧없음>도 잘 이해한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갈증>을 일으켜 <애착>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떤 소원이 성취되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딱 한 번이라도 <어떤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 <애착>을 갖는 대부분 사정이 이와 같다.
그래서 <다음 의문>을 갖기 쉽다.
어떤 이가 현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등을 관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이로 인해 어떤 이가 <현실 일체>를 반드시 싫어하게 되는가.
그리고 <떠날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가.
이처럼 <의문>을 갖기 쉽다.
한편 <다음 의문>도 가질 수 있다.
현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고 <반드시> 이에 대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처럼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일반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음처럼 의문을 갖기 쉽다.
현실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싫어하고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을 굳이 없앨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한편, 일체에 대해 <기쁨과 즐거움>을 없애야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걱정>하게도 된다.
평소 현실에 대해 <집착>을 갖고 임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들이 <무상ㆍ고ㆍ공ㆍ비아>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이해만으로 현실에 대한 <집착>을 잘 버리지 못한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경전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의문>을 놓고 그 사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반복끝]
♥Table of Contents
▣○ 마음의 해탈(심해탈)의 효용
*pt* 처음 to ○ 잡아함-수행-심해탈 K0650sf-- ♠심해탈의 효용
♥Table of Contents
▣- 생사고통의 <예방>과 <원인의 제거>
모든 생명은 <좋음>을 구한다.
그리고 삶에서 <나쁨과 고통>을 없애고자 한다.
이는 모든 생명의 사정이 같다.
세속의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방안>에서는 서로 다르다.
이 의문을 해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생사현실에서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다음처럼 본다.
고통이 <윤회의 긴긴 과정>을 통해 반복해 나타난다.
생사고통은 이번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삶과 윤회의 긴긴 고통>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다.
먼저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집착>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뜻, 말, 행위, 태도 등의 <업>을 일으킨다.
그런 결과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혹(惑, 번뇌)-업(業)-고(苦)]
따라서 <삶과 윤회의 긴긴 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원인>이 되는 <번뇌와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번뇌와 집착>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다시 이런 <집착>을 일으키는 바탕을 제거해야 한다.
즉, <잘못된 견해>와 <망상분별>,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수행 목표>가 된다.
삶과 윤회를 통한 <긴긴 고통>은 <망집번뇌>에 바탕한다.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발생한다.
또 그런 집착은 <잘못된 분별>로 갖게 된다.
평소 자신은 <자신, 자신의 것> 등에 <집착>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집착을 가질만한 실다운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집착을 가질만한 실다운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따라서 <올바른 진리의 내용>을 올바로 관해야 한다.
평소 <자신과 자신의 것>들에 집착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사실은 <집착을 가질만한 실다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깨닫는다.
그래서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소멸된 니르바나의 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
『잡아함경』 처음에 제시한 것과 같다.
즉, 자신이 자신과, 자신의 것을 집착한다.
그런데 이들 일체 현상은 <무상>하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관한다.
이로써 그런 <덧없고 무상한 현상>들에 <탐욕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무상]
또한 일체는 <생멸>한다.
자신이 집착하는 <자신,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들 <생멸하는 현상>은 무너지고 사라진다.
그로 인해 <고통>을 주게 된다. [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좋음>일 뿐이다.
그리고 다음의 <긴긴 고통의 윤회의 결과>를 가져오는 징검다리가 된다.
그래서 <일체 생멸하는 현상>이 모두 다 <고통>이다.
<이런 사정>을 관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고]
한편 일반적으로 자신이 <자신, 자신의 것> 등에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일체는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자세히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얻어낸 마음내용>이다.
그리고 <실재>가 아니다.
그 <본바탕 실재>는 얻을 수 없고 공하다.[공]
그러나 <현실>은 매순간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는다.
따라서 현실 내용은 <꿈>과 성격이 같다.
즉,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같다.
<실재가 공함>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써 <현실>이 이처럼 <꿈과 성격이 같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실다운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집착>을 버려야 한다.
또 이들은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실체의 내용>이 아니다. [무아ㆍ비아ㆍ무자성]
이들 생사현실 일체는 마치 <꿈>과 <환영>과 같다.
따라서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실답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올바른 깨달음>으로 <<현실의 정체>를 잘 관해야 한다.
자신이 평소 <집착을 갖는 것>이 있다.
<자신과 자신의 것>들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지위, 명예...등에 집착한다.
이들은 모두 <망상 분별>을 바탕으로 집착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에 묶여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런 경우 그런 <번뇌의 묶임>에서 풀려난다.
또 그에 바탕하여 행하던 <악>을 중지한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또 그로 인해 <삶과 윤회를 통한 긴긴 고통의 결과>를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후 <잘못된 망상 분별>에서 풀려난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지혜의 해탈]
그런데 <다른 중생>은 여전히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다른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서원을 위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또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무량한 서원>을 원만히 성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사현실>에 <집착>과 <번뇌>를 갖지 않고 임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고통>을 받는 과정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계>의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이처럼 진리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리고 현실 내용이 나타나는 <인과관계>도 잘못 파악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자신>과 <자신의 것>으로 보는 내용에 집착한다.
즉, 자기 자신에 강한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각 생명은 그런 <집착>을 바탕으로, 삶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나쁨과 고통>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리고 <좋음>을 구한다.
우선 자신의 <생존과 생계>를 해결할 방편을 찾는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유지할 방편을 찾는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좋음을 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해간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재산과 명예나, 지위...등에 애착을 갖는다.
그런 가운데 이를 추구해간다.
그러한 것을 모두 나열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 신체, 건강, 시간, 장수, 즐거움, 지혜, 지식, 아름다움, 인격,
직업, 지위, <물질>적 부, 명예, 인간관계, 사랑, 결혼, 가정, 자손, 권력, 자유
타인, 다른 생명, 사회, 자연에 갖는 희망들이다.
♥Table of Contents
▣- <가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
한편 <가치>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
그것이 진정 <가치>가 없다.
그런 경우에도 <가치>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다.
현실에 손과 발이 있다.
그리고 희귀한 도자기나 금, 은, 보석이 있다.
또 어떤 것이 단지 특이하거나 희소하다.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없다.
그런 경우 곧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이에 집착한다.
이 가운데 금은보석을 처음 관심을 갖고 대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처럼 무언가에 <관심과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 가치가 없어도 <가치 있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그리고 <집착>을 갖는다.
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져 거래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 가치가 없더라도 이를 <집착>한다.
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진정 가치가 있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무시한다.
그런 가운데 손발과 금은보석을 놓고 생각한다고 하자.
<손과 발>은 누구나 대부분 갖고 있다.
또 그래서 평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지도 않는다.
반면 <금은보석>은 희귀하다.
그래서 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그래서 평소 금, 은, 보석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쉽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금,은,보석>을 추구한다.
이들은 희귀하다.
그런 사정으로 이를 <성취하는 경우>도 드물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 오히려 <집착>한다.
그런 바탕에서 이를 <추구>한다.
그러나 성취해도 <가치>가 적다.
그래서 대부분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잘못된 희망>의 <잘못된 방안>을 통한 추구
일반적으로 뒤바뀐(전도된 가치판단>에 바탕해 현실에 임한다.
그러면 그런 바탕에서 <부질없고 쓸데없는 희망>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바탕에서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를 일으킨다.
이로써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에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집착>에 바탕하여 행위한다.
잘못된 뒤바뀐 <망상 분별>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애착과 집착>을 갖는다.
그런 바탕에서 <업>을 행해 간다.
그래서 살아가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수단과 방안>을 통해 좋음을 구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좋음>을 잘 얻어내지 못한다.
<이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잘못된 처방>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인과관계>에 맞지 않은 처방인 경우다.
예를 들어 바위에 머리를 부딪치면 낫는다는 <처방>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한다.
이로써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받는다.
또 이로 인해 세세생생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
또한 좋음을 얻고자 <일정한 수단>을 구한다.
그런 가운데 다시 그 <수단>에 집착한다.
그래서 좋음을 얻어낼 <수단>은 얻는다.
그러나 정작 그를 통해 <최종적인 좋음>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안히 살기 위해 <집>을 구한다.
그래서 <집>을 얻는다.
그렇더라도, 정작 그 <집>에 집착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를 통해 얻고자 한 <좋음과 평안함>은 얻지 못한다.
오히려 그 집으로 인해 온갖 <근심, 걱정 등 번뇌>에 싸여 살아간다.
이처럼 현실에서 <좋은 수단>을 풍부하게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늘 <번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집착>이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모습
처음 어떤 것이 자신에게 <좋음>을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에 <집착>을 갖는다.
한편, <집착>을 많이 가질수록 <좋음>을 잘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집착>은 <약간의 좋음>을 주는 대신 <긴긴 고통>을 가져다준다.
<집착>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어떤 <좋음>에 집착한다.
그런데 <그 집착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이를 얻기 전까지 <갈증과 불만, 불쾌, 고통>에 시달린다.
한편 이처럼 무언가에 <집착>한다.
그런 경우 그로 인해 눈이 가려진다.
그래서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것>을 함부로 침해한다.
<자신의 좋음>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생명에게 <나쁨>을 가하게 된다.
한편 <욕구>를 끝내 뜻대로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강한 <불만과 불쾌, 슬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집착을 갖는 정도>에 비례한다.
한편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잠시 좋음>을 얻는다.
그러나 곧 달라진다.
그에 대해 <관심>을 잃기도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좋음>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다시 <집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간다.
그러나 여전히 <집착>을 갖고 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이 <사라질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
한편 평소 <좋음>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자.
그래도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새삼 그에 대해 다시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처럼 <좋음>에 집착한다.
그런 경우 이를 <아낀다>.
그래서 온 생명을 위해 널리 <좋음>을 베풀지 못한다.
그래서 <공덕>을 쌓지 못한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좋음이 <침해>된다.
그런 경우 이를 평안히 <참지 못한다>.
그 상황을 좋게 이해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는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다시 나쁨을 가하여 <해치려 한다>.
그리고 <보복>을 행한다.
그리고 이후 무한한 시간에 걸쳐 서로 <나쁨>을 <주고 받는다>.
그런 가운데 이 <나쁨>을 키워 나간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많은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행위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생명의 좋음>을 <침해>한다.
그리고 <다른 생명에게 나쁨>을 가한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한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긴긴 고통>을 받게 된다.
한편 그것이 정말 사라진다.
그런 경우 그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현실에서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의 제거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에 <집착>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적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이나, 명예, 지위, 권력과 같은 경우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것에 <집착>을 갖는다.
그런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갈증 불만>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상실에 대해 <고통과 두려움>을 갖는다.
다만, 세속 생활에서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집착>을 가졌다고 하자.
이런 경우 삶에서 <방편>을 잘 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넓은 세상>을 <관찰>한다.
그래서 그보다 <가치가 많은 것>을 많이 살핀다.
그리고 <가치가 큰 다른 것>과 비교해 본다.
그런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임을 관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이나 지위에 집착을 갖는다.
그런 경우 <그처럼 집착하는 것>과 자신의 <생명>과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그런 경우 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먼지나 티끌>처럼 가치 없다고 여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로써 <집착>을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부분만큼은 <평안한 마음>에 머무를 수가 있다.
즉, 그것을 잃거나 얻음에 관계없이 <평안한 마음>에 머무를 수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집착>의 근원- 자신과 생명 등
<가치판단>을 넓고 길고 깊게 잘 행한다.
그러면 현실의 많은 것에 <집착>을 버릴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는 집착을 버리기 어렵다.
그래서 살아가는 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집착>을 갖고 임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삶의 번뇌>와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끝내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이 현실에서 <어떤 내용>을 얻는다.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얻는다.
이는 <자신이 얻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세상의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이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명, 목숨, 신체>에 집착을 많이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집착>을 버리기 힘들다.
그것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강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런 <망상분별>을 바탕으로 <번뇌와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에 바탕하여 <행위>를 해나간다.
그런 결과 <생사고통>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처음 <망집>에 바탕해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경우 <그런 부분>은 <생로병사>를 겪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생명>이 허물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애착을 갖던 것>을 함께 모두 허무화시킨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 <늙음, 질병, 사고, 죽음> 등은 끝내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생, 노, 병, 사>는 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주게 된다.
삶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다. [애별리고]
미운 이와 만난다. [원증회고]
구하는 데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구부득고]
수행을 통해 <망집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고통과 두려움>은 매 생마다 <반복>해 받아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이번 한 생 뿐만 아니라 윤회를 통해 매생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불교 수행>은 이에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 생사고통의 원인으로서 <집착>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이 문제된다.
그래서 <태어남과 늙음과 질병,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아예 없게 하는 것>을 방안으로 찾게 된다.
그러나 그런 방안으로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세상을 올바로 관한다.
그래서 일체가 무상, 고, 공, 무아, 무자성 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탐욕을 떠나 집착을 끊는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서 해탈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
따라서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이 사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오늘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무수한 생명이 태어난다.
또 무수한 생명이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그런 가운데 제 각각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는 정작 <다른 생명>에 대해 그다지 애착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집착>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생명이 어디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자.
그런 사실 앞에서도 아무런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인가 아닌가에 따라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그 사정은 단순하다.
자신은 자신의 생명에 <집착>을 갖는다.
또는 자신의 가족에 <집착>을 갖는다.
이런 경우 바로 <그런 애착과 집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 그것이 상실되면 <강한 고통>을 겪는다.
반면 <다른 생명>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함>을 유지한다.
이는 그가 그런 다른 생명에 대해 크게 <애착과 집착>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문제된다.
이는 그가 망상분별에 바탕에 그런 내용에 <집착>을 갖고 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그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애착과 집착>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애착과 집착>을 갖게 하는 <바탕>을 제거해야 한다.
즉, 잘못된 <망상 분별>을 먼저 버려야 한다.
이는 결국 자신과 세계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분별>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 주체가 현실에서 <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망상분별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 제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이런 분별>을 그대로 둔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업>만 중지하게 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에 묶이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이런 분별들이 <잘못된 분별>이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평소 <자신으로 여기고 대한 내용>이 있다.
이를 '실다운' 진짜 자신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고통>을 없애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고통을 받게 하는 <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 업을 행하게 하는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것에 대해 <집착>을 버린다.
그러면 자신의 뜻대로 얻지 못한다고 해도 <갈증과 불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그것이 장차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집착>이 제거된다고 하자.
그러면 <좋음>을 또 아낌없이 잘 베풀 수 있다.
또한 다른 생명에게 <나쁨>을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쁨에 <나쁨>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쁨>을 계속 주고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을 <고통>도 피할 수 있다.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대하는 것이 있다.
이들이 <실다운 것>이라고 하자.
그래도 앞과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것>으로 보는 내용은 사실은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따라서 <실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그렇게 <집착을 가져야 할 내용>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것>으로 현실에서 여기고 대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하나 같이 한 주체가 <현실에서 얻는 내용>이다.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다.
이들은 <자신이 얻어낸 내용>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얻는 마음내용>이다.
그리고 <생사현실 내용>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실답지 않다>.
그럼에도 각 생명은 그런 사실을 올바로 관하지 못한다.
<어리석음>에 바탕하여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내용> 가운데 <일 부분>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일으켜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행위>를 행한다.
그로 인해서 살아서 <고통>을 받는다.
또 그로 인해 <고통의 윤회>를 하게 된다. [혹-업-고]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경우 원칙적으로 <망집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관찰>로서 <그런 잘못된 분별>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 대신 <올바른 깨달음>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분별>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에 바탕한 <애착과 집착>이 함께 없어진다.
예를 들어 평소 <자기 자신으로 보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경우 이들이 <잘못된 분별>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실다운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집착을 가질만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하자.
그래도 <실질적인 자신>은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업>을 하지 않음으로 이후 상태가 오히려 좋아진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이해를 통해 <애착과 집착>이 없어진다.
그런 경우 이런 내용이 없어진다고 해도 <고통과 두려움>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평안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의 묶임>에서 풀려난다.
즉, 마음의 <해탈>[심해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 이로 인해 <번뇌와 집착>에 바탕해 임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업>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다른 주체와 <가해 피해관계>로 얽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집착을 떠나 <올바르고 선한 수행>을 닦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업장>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스스로 일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여긴다.
이들이 곧 현실에서 얻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다.
이런 현실 내용에 평소 <집착>을 갖고 임한다.
그런데 이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영원>하지 않다.
일정한 조건에 의해 인연이 화합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변화하는 덧없는 것이다. [제행무상]
그것은 변화하여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집착을 가질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집착>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잠시 <좋음>을 준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긴긴 고통>을 받아 나가게 된다. [일체개고]
그래서 <이런 사정>을 먼저 올바로 관해야 한다.
한편, 그런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실재>의 내용이 아니다.
<실재>는 <본바탕의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말한다.
<일정한 주체가 관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실재>는 끝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을 행할 수 없다.
즉, 있다ㆍ없다ㆍ-이다ㆍ-아니다ㆍ-과 같다ㆍ-과 다르다ㆍ좋다ㆍ나쁘다...등의 <분별>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의미를 갖지 않는> '공'이란 표현을 빌려 나타내게 된다. [일체개공]
또 이들에는 진짜라고 할 <실체의 내용>이 없다. [무아, 무자성]
영원 불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집착을 가질만한 <실다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 외, <자신>과 <자신의 것>에 대한 <관념적 분별>은 잘못된 <망상분별>이다.
여하튼 이렇게 올바로 관한다고 하자.
이로써 <현실>은 <꿈과 같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환영과 같음>을 이해한다.
즉, 영원불변한 <본체>가 아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어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집착을 가질 만한> <실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올바로 모든 현실을 올바로 관하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태어남ㆍ늙음ㆍ병듦ㆍ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다.
경전에서 <다음 내용>을 제시한다.
...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대하여
잘 알고, 밝으며, 잘 끊고,
탐욕을 떠나 마음이 거기서 해탈하여서,
그는 결국 수행의 목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남ㆍ늙음ㆍ병듦ㆍ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
...
(『잡아함경』 0004. 무지경2)
♥Table of Contents
▣○ <수행목표>와 <수행방편>에 대한 <집착>의 제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심해탈>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초월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세속 현실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속>을 떠나 <수행>을 처음 시작한다.
이 경전은 이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존에 <세속>에서 가졌던 집착을 버려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단지 <세속생활>에 대한 <집착>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행>에서도 <집착>은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수행>에 있어서도 <집착>을 버리고 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처음 세속에서 <집착>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이런 경우 <집착>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적은 것>임을 관하게 된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집착>을 많이 버린다고 하자.
그래도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망상 분별>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집착>은 잘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집착>이 <모든 집착>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를 끝내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평소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자신이나 세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에 대하여도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세속에서 가졌던 <집착>을 버린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분별>과 <집착>을 버린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다시 <수행목표>나 <수행방편>에 대해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집착>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집착> 또한 <잘못>이다.
<집착>은 모두 집착의 독과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세속의 삶>에 관한 것이던, <수행>에 대한 것이던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행목표나 수행방편에 대해서도 역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해서' 수행을 정진해 가야 한다.
또 이들에 <상>을 취하지 않고 <상>에 머물지 않는 가운데 수행을 해야 한다.
이들 수행목표나 수행방편 역시 <본래 얻을 것이 없다>.
그것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상>을 취하거나, <집착>하더라도 본래 그렇다.
그런데 <생사현실>에서는 <집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게 된다.
<망집>에 바탕해 <상>을 취하고 <수행>을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로 인해 그 수행도 <원만>히 성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행을 뜻과 같이 원만히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수행자 자신부터 그런 <망집>을 제거하고 <상>을 취하지 않고 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 <수행>도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제 402권 환희품)
○ <집착>을 버림과 <적극적 수행>과의 관계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일체의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
그런 경우 <망집>의 제거의 의미를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이는 <생사현실>에서 <아무 것도 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생사현실에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 희<망>을 갖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일체 행위>를 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평소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경우 그에 바탕해 <쓸모없는 희망>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업>을 행한다.
이런 경우 <가해 피해관계>를 일으킨다.
그리고 <업장>을 쌓는다.
또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망집>에 바탕한 소원을 당연히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행 목표>나 <수행방편>은 잘 실천해가야 한다.
다만 <집착>을 버린 가운데 <수행>을 정진해가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런 바탕에서 <행하지 않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있다.
세속에서 집착을 갖고 행하던 <업>이 있다.
이는 <고통의 윤회>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끊고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계행>을 성취하고 <업장>을 제거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반대로 행해야 한다.
즉,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행하던 <업>이 있다.
이는 <집착>을 버리고 끊고 중지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목표>는 <집착>을 버린 가운데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이는 그 각각이 <고통>을 멸한 상태로 향하는가.
아니면 <고통>을 일으키는 상태로 향하는가에 따른 차이다.
그리고 이 일체에 대해 <그 정체>를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두에 대해 기본적으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양 방면의 수행을 모두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성취>해나가야 한다.
○ 마음의 <해탈>과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와의 관계
현실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다.
이를 올바로 관한다.
그러면 <싫어하고 떠날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를 마음이 번뇌의 묶임에서 풀려 벗어남[심해탈]이라 한다.
지금껏 <자신>과 <자신의 것>이라고 잘못 보고 대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애착>을 갖는다.
그런데 <그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싫어하고 떠날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사 현실 일체에 대해 <애착과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마음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자세와 혼동하기 쉽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내용을 <부정>한다.
그리고 싫어하고 <혐오>한다.
삶 일체를 <비관적>으로 대한다.
모든 것을 <체념 포기>한다.
아무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다.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임하려 하기 쉽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즉 스스로 <일정 부분>을 취해 그것을 <자신>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에 대해 <애착과 집착>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망집>을 바탕으로 <업>을 행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 그런 바탕에서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먼저 <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망상 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올바로 관한다.
그래서 <집착>을 버린다.
그런데 이는 단지 <모든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을 체념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또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는 상태>로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처럼 <집착>을 제거한 가운데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
그 상태에서 <맑고 깨끗한 서원>을 올바로 일으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유희 신통력을 가지고 정진해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 무한히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집착을 버린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광대>해진다.
그리고 무한히 넓어진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상태는 본래 청정한 진여 실재의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런데 이 상태를 현실의 <잘못된 망상, 분별>이 덮어 가리고 있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올바로 <이 사정>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런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래서 원래의 청정 진여 <니르바나>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번뇌 집착>, <악>과 <고통>을 지우고 없앤다.
그래서 원래의 청정 진여 <니르바나>가 드러난다.
이런 것이 1차적 <수행목표>가 된다.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생사현실>이 곧 <니르바나>임을 올바른 깨닫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임해서도 <니르바나>에 상응한 상태로 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고통은 제거한다.
또 한편 <생사현실>의 <다른 선한 측면>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제2차적 <수행 목표>가 된다.
한편 이 상태에서 다시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겪는 중생>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들 중생에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무량한 서원>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들어가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 하여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무량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한다.
그래야 중생을 잘 <제도>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불국토를 장엄>하고 <성불>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것이 제3차적인 <수행목표>가 된다.
이를 <꿈>의 비유로 살펴보자.
꿈에서 <악몽>을 꾼다고 하자.
그런데 <꿈>을 깬다.
그러면 <꿈>이 <현실>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리고 <꿈>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꿈>을 꾸는 상태에서는 그런 사실을 잊는다.
그리고 <꿈> 안에서 다시 악몽에 시달린다.
그런 경우 <해결방안>은 꿈을 깬 후 다시 잠에 들지 않는 것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꾸지 않는 것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력하여 <꿈>을 꾸는 상태에서도 그 꿈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설령 <꿈>을 꾸어도 무방하다.
<꿈>을 꾸어도 그것이 곧 7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굳이 <잠>에 들지 않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신이 <꿈> 밖에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꿈> 안에서 얻을 좋은 내용은 그대로 함께 얻어내는 것이 낫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적극적으로 <꿈> 안의 내용을 좋고 아름다운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더욱 낫다.
<생사현실> 안의 수행도 이런 꿈의 비유와 마찬가지다.
처음 기본적으로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래서 <망집>을 제거하는 노력에 치중한다.
그래서 <기본 수행>이 성취된다.
그런 경우 이후 나머지 <생사현실>의 선한 측면까지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 생사현실 안에서 <자비심>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위해 <무량한 서원>을 성취해간다.
그러면 훨씬 낫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목표>를 실천해간다.
그런데 <이런 수행>에 대해서도 역시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정진해야 한다.
본래 얻을 것이 없다.
따라서 집착을 갖고 임하던 그렇지 않던 본래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런 <본 상태>에 상응해 임해야 한다.
그래야 서원을 <원만히 잘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시에는 '무소득을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취해 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대해서 잘 관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잘 안다.
그리고 밝으며, 잘 끊는다.
그리고 탐욕을 떠난다.
그래서 마음이 거기서 <해탈>한다.
그러면 결국 <태어남ㆍ늙음ㆍ병듦ㆍ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초월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앞과 같은 수행 목표들>을 향해 노력해갈 수 있게 된다.
*pt* 끝 to ○ 잡아함-수행-심해탈 K0650sf-- ♠심해탈의 효용
[반복]
>>>
♥Table of Contents
▣● <무상ㆍ고ㆍ공>과 <수행목표>
한편, 경전에서는 <해탈지견> 내용을 다음처럼 제시한다.
즉 어떤 이가 <현실의 정체>에 대해 바르게 관찰한다고 하자.
그러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긴다고 하자.
그러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을 <심해탈>이라 한다.
...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해탈>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이가 만일 스스로 <증득>하고자 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스스로 <해탈을 통해 얻는 지혜의 내용>[해탈지견]를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다.
즉,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
<범행>은 이미 섰다.
<할 일>은 이미 마쳤다.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아생이진... 불수후유]..
이런 내용이다.
결국 수행자는 현실을 올바로 관함으로 <마음의 해탈>(심해탈)을 얻는다.
그리고 이런 <심해탈>을 통해 위와 같은 상태를 <증득>한다.
그래서 이런 <해탈지견>은 불교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이런 <해탈지견을 얻는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해탈지견>의 내용
<심해탈>을 통해 <해탈지견>을 증득할 수 있다.
<해탈지견> 내용은 다음이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등이다.
[아생이진... 불수후유]
그런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세상에서는 <다음 견해>를 갖는 경우도 있다.
우선 죽은 뒤 ‘<자신>은 아주 없어진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것>은 이후 아무 것도 없게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다른 생명형태로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견>(斷見)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단견>을 부정한다.
그리고 중생들이 <망집>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무한히 <생사윤회>를 반복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을 제시한다.
<심해탈>을 통해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제시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다시 <다음 의문>을 갖게 된다.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고 경전에서 제시한다.
그런데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는 <단견>과 같은가?
즉 죽음 이후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 <수행목표 상태>와 <일반 상태>의 차이점
한편, <수행>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이는 <현실 일반 상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수행>을 행한다고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해탈지견>을 증득>한다.
그런 경우 <일반적인 상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무상ㆍ고ㆍ공ㆍ비아>와 <수행목표 상태>의 관계
<수행목표 상태>는 <일반 현실 상태>와 일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 <일체에 대한 근본판단>과 관련해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처음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수행목표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일체>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수행으로 <심해탈 상태>가 된다.
그리고 <해탈지견>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무상ㆍ고ㆍ공ㆍ비아>' 아닌' 상태가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심해탈>이나 <열반> 상태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 상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무상ㆍ고ㆍ공ㆍ비아>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처음 제시한 내용은 <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한편, <해탈>과 <열반>도 <일반 상태>처럼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면 <수행목표 상태>는 <일반 현실>과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갖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런 전제에서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수행목표>와 <염리, 희탐진>
<심해탈> 상태가 되어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상태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다.
따라서 다시 <염리 희탐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즉, <수행목표 상태>도 <현실 내용>처럼 역시 싫어하고 떠나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 수행의 <근거>
<심해탈>에 이르러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일반 현실>과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 수행을 통해 <심해탈>을 굳이 얻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수행>은 <일반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어야 이를 행할 필요성이 있다.
불교를 처음 대할 경우 이런 <여러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
>>>
[반복끝]
앞에 나열한 의문들은 모두 <수행의 목표 상태>와 관련된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색ㆍ수ㆍ상ㆍ행ㆍ식]
그런 상태에서 이에 대해 <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그에 <애착>을 갖고 임한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모두 <집착>을 버려야 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는 것을 몹시 어려워한다.
심지어 오히려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 의문을 제기한다.
자신이 지금껏 <애착>을 갖던 것이 있다.
자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지위, 명예...등등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모두 <애착>을 버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로 인해> 자신은 <무엇>을 대신 얻는가라고 의문을 갖기 쉽다.
그런 가운데 <집착>을 버리고 <수행>을 한다.
그런 경우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일반 현실>의 상태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그에 관한 내용을 다음처럼 살펴보기로 한다.
[반복]
>>>
♥Table of Contents
▣● <해탈지견>의 내용
<심해탈>을 통해 <해탈지견>을 증득할 수 있다.
<해탈지견> 내용은 다음이다.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등이다.
[아생이진... 불수후유]
그런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세상에서는 <다음 견해>를 갖는 경우도 있다.
우선 죽은 뒤 ‘<자신>은 아주 없어진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것>은 이후 아무 것도 없게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다른 생명형태로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견>(斷見)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단견>을 부정한다.
그리고 중생들이 <망집>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무한히 <생사윤회>를 반복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을 제시한다.
<심해탈>을 통해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제시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다시 <다음 의문>을 갖게 된다.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고 경전에서 제시한다.
그런데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는 <단견>과 같은가?
즉 죽음 이후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
[반복끝]
♥Table of Contents
▣○ 해탈과 단견의 차이
수행을 통해 얻는 <최종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수행을 마치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의문을 갖는 이가 있었다.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수행을 시작하여 <최고 상태>에 이른다고 하자.
그러면 <아라한>이 된다.
그런 경우 <불수후유>라고 표현한다.
즉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불수후유>란 표현의 의미를, 다음처럼 이해하는 이가 있었다.
즉, <아라한>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죽은 다음 아무 것도 없다.
<아주 없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잘못임을 경전에서 제시한다.
(『잡아함경』 0104. 염마경焰摩經, 『잡아함경』 0966. 부린니경富隣尼經)
부처님은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신다.
...
이와 같이 비구들아,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만일 스스로 증득하고자 하면
곧 스스로 증득할 수 있으니,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여기에서 '<생은 다했다>',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보자.
이 구절만 잘 살펴보자.
나의 <생>이 <이미 다하였다>고 표현한다.
또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표현을 대할 때 다음처럼 잘못 이해하기 쉽다.
즉, ‘<생>이 이미 다하였다,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 =>
죽고 아무 것도 없다’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마음이 해탈했다고 곧 그 수행자>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음’을 제시한다.
또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음'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수행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해한 내용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현재, <자신이 죽은 뒤 아무 것도 없다>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즉, 죽은 후 아주 없어져 <자신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멸관>이다.
위 표현은 그런 <단멸관>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이런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윤회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신다.
<후생의 몸>을 받는다, 또는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바로 이런 <윤회>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수행의 <목표 상태>를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윤회>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윤회>와 관련한 수행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다음처럼 생각한다.
생명은 그저 <물질>이 이리저리 결합한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스럽게 <생명체>를 이룬다.
그리고 외부 <물질>변화에 자극을 받아 반응한다.
이것이 <생명체>의 정신이다.
그런 가운데 <생명체>는 살아간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그처럼 태어나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
그러면 그 뿐이다.
이렇게 잘못 여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와 달리 <윤회>를 한다고 밝히신다.
한 주체가 <망집>을 일으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한 주체가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처럼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한 생 안에서 <생-노-병-사>의 생을 마친다고 하자.
그래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런 바탕에서 다시 죽은 이후 <다른 생명체의 형태>로 변화한다.
그런 경우 이후 <후생 몸>을 받아 계속 <다른 생명의 형태>로 이어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일으킨 <번뇌>와 <업>(뜻, 말, 행위)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시 <1생>을 산다.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는 여러 상태의 세계가 있다.
[3계 6도-<무색계, 색계, 욕계>- 지옥,아귀,축생,인간,수라,하늘]
그러다 죽으면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나 1생을 산다.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 형태>를 바꾸어 살게 된다.
<윤회>는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한편 이미 모든 생명체가 지금껏 그<와 같이 살아 왔음>도 의미한다.
『잡아함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윤회에 대해 설한다.
....
그 나쁜 인연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인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
몸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뜻으로 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에 화생한다.
(『잡아함경』 0094. 승가라경僧迦羅經)
그리고 불교 전반을 통해서 <윤회>의 내용이 제시된다.
이에 의하면, 각 주체가 <무한한 시간> 동안 <윤회>의 과정을 거쳐 살아왔다.
자신이 일일이 기억을 못 한다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 번 죽을 때 흘리는 피>를 정한다고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죽을 때마다 흘린 피를 모은다고 하자.
그런 경우 <바닷물>과 이런 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을 것인가를 묻는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윤회과정 동안 흘린 피>가 더 많다고 제시한다.
(『잡아함경』 0937. 혈경血經)
이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도 그와 같음도 나타낸다.
그런데 어떤 이가 수행을 하여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러면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음>’을 스스로 증득한다.
그리고 <본래 생사 생멸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후 그런 바탕에서 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 <윤회>와 <삶의 목표>
<윤회>에 대한 입장은 각기 다르다.
<일반적인 입장>은 다음처럼 생각한다.
죽어서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죽음은 안타까운 일로 여긴다.
그리고 삶이 <허무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일단 <윤회>를 한다고 하자.
이는 죽은 후에도 <다른 생>을 다른 형태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좋다고 여긴다.
그리고 무한히 <윤회>한다고 한다.
따라서 무한히 <또 다른 생>을 살아 더 좋다고 여긴다.
그래서 윤회하는 경우, <사후 생>을 잘 이어갈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윤회에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윤회는 <망집>에 바탕해 자신을 취하는 바탕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사 고통>과 관련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입장은 부처님과는 <정반대 방향>이 된다.
부처님은 <생사윤회>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시한다.
이는 <망집>에 바탕해 겪게 되는 <생사고통>의 현상이다.
예를 들어 <윤회>의 과정 동안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수명>이 인간보다 매우 장구하다.
그래서 수십억 년의 수명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또는 겁으로 헤아리는 긴 수명을 갖고도 살 수도 있다.
<경전>에 다음 내용이 나온다.
...
인간의 1,600년은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의 하루 낮 하룻밤이다.
이와 같이 30일을 한 달,
열두 달을 1년으로 계산하면,
<타화자재천>의 수명은 1만 6,000년이다.
(『잡아함경』 0863. 타화자재천경他化自在天經)
1600년*365* 16000= 9,344,000,000년 = 93억4천4백만년
그 외의 다른 하늘 사정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처럼 <하늘>에서 <긴 수명>을 갖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자.
이는 그것만 놓고 보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역시 <영원>하지 않다.
즉, <무상>하다.
그런 까닭에 다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고통스런 <윤회> 과정을 받게 된다.
이런 차이를 다시 살펴보자.
<일반인>은 죽으면 당연히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일반인은 이렇게 여긴다.
사람이 죽으면 이후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사후 이어가는 <후생>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제시한다.
그래서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 일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다.
생사윤회는 기본적으로 <망집>에 바탕한다.
어떤 이가 <망집>을 일으켜 임한다.
망집에 바탕해 <일정 부분>을 <자신>으로 여겨 취한다.
그러면 매순간 <일정한 내용>을 <자신>으로 취한다.
<그런 바탕>에서 이후 <생사>를 받아나간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무량한 생사과정>을 거친다.
이는 <생사고통>을 겪는 과정이다.
그리고 <망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런 생사과정>은 무량하게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무량하게 반복해 받아나간다.
<생사과정>에서 일부 <좋음>을 얻는다,
그래도 이는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그런 사정으로 <생사윤회과정>은 전체적으로 <고통>에 귀결된다.
따라서 이는 <전체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망집>에 바탕한 <생사윤회>를 근본적으로 끊고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런 긴긴 <고통의 생사과정>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생사윤회>는 <수행>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수행>을 행한다.
이를 통해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러면 위와 같은 <생사윤회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목적 상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사>를 벗어나 <후세 몸>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쉽게 성취되는 일이 아니다.
어려운 <수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다음 생의 몸> 즉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불수후유]는 사실을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 제시한다.
즉, <망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이런 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의 생각>과는 동 떨어지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윤회>의 증명 문제
<윤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현생을 살아가는 주체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각 주체는 <태어나기 전의 상태>나 <죽은 후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없다.
그런데 <윤회>의 문제를 살피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생전>과 <현생> 및 <사후>의 상태를 이어서 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사과정>에서 각 주체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몇 생을 계속 이어 <그 인과관계>를 살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계를 관할 수 있는 능력을 3명 6통에서 제시한다. [숙명명宿命明 천안명天眼明 등]
그런 가운데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못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런 입장>에서 윤회를 제시한 것이다.
또 그런 전제에서 <생사과정에서 향해 나아갈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그런 내용>을 직접 관할 수 없다고 하자.
그리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내용
>을 그대로 믿지도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결국 자신의 <좁은 경험> 범위에서 <직접 경험한 것>만을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 갇히게 된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직접 <아프리카>를 갈 수도 없다.
또 <아프리카>를 갔다 온 이가 보고하는 내용도 못 믿는다.
그런 경우 자신이 현실에서 <경험한 내용>만을 진실로 알고 고집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경우 그는 <그런 판단>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이런 <비유>와 <생사 현실> 사정이 같다.
그래서 <이 한계>를 직접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3명 6통>[예: 숙명통]을 가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직접 <과거 생의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관계>를 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런 한계> 안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부처님이 <그런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시할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부처님에게 <그럴 이유가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런 경우 부처님이 <거짓을 제시할 경우>들을 나열해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어떤 이가 <진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잘못된 내용>을 착오로 <진실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즉, 악의 없이 진실을 잘못 알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일부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 또는 사후에 걸쳐 타인의 행위나 <부당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그런 경우가 있다.
또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 말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단지 상대를 부당하게 <괴롭히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 말하는 경우도 있다.
<사후 내용>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 제시한다고 하자.
<생사윤회>가 그런 내용에 속한다.
그런데 <이 내용의 참거짓>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이는 우선 사람을 <거짓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함>이 아니다.
어떤 이가 <윤회>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를 전제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윤회를 통해 무언가 상대를 속여 <공연히 행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입장>은 그 반대다.
그와는 반대로 그런 <윤회를 끊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윤회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한편 이런 윤회 내용의 <참거짓>을 판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부처님이 하신 다른 말씀>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본다고 하자.
그런 경우 부처님 입장은 <앞 경우들에 모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사윤회를 하는 것>에 반신반의하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불확실한 경우수>를 놓고 현명하게 임해야 한다.
그래서 마치 현실에서 <현명한 도박사>가 임하듯 임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먼저 사후 <생사과정이 전혀 없는 경우>도 가정해본다.
그리고 생사과정이 있되 부처님이 <제시한 내용과 다른 형태>도 가정해본다.
예를 들어 무한히 생사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몇 번의 윤회만 거친다.
또는 3계 6도를 생사윤회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만 생사과정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수>를 벌려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경우>가 되던 모두 동일하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방안을 먼저 찾아본다.
<그런 방안>이 찾아진다고 하자.
그러면 굳이 위 각 경우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일일이 판단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나 <그 방안>을 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방>안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수행방안>이다.
수행방안은 이후 <생사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고해도 좋다.
또 <생사가 이어지는 경우>라고 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생사가 무량하게 이어지는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순히 <현명한 도박사>의 입장이라고 해도 수행방안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행자 자신이 직접 <윤회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런데 수행자가 <계ㆍ정ㆍ혜> 수행을 잘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숙명통, 천안통> 등을 증득하게 된다. [6신통]
그러면 수행자 자신이 <이런 생사과정>을 직접 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각 생명이 살고 죽는 과정>을 잘 관해야 한다.
그래서 각 생명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업>을 행해 사후에는 <다시 어떻게 되는가>도 잘 살펴야 한다.
또 그런 가운데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그 답>을 스스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이런 내용>을 스스로 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도 수행은 필요하다.
[반복]
>>>
♥Table of Contents
▣● <수행목표 상태>와 <일반 상태>의 차이점
한편, <수행>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이는 <현실 일반 상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수행>을 행한다고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해탈지견>을 증득>한다.
그런 경우 <일반적인 상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반복끝]
여기에 대해 간단히 먼저 답을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과 같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의 어려움>과 <수행의 가치>의 인식 필요성
<수행>은 참으로 어렵다.
처음 <수행>을 시작한다고 하자.
그런데 『잡아함경』 구절은 이런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법문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다.
그렇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쉽게 실천되는 내용>은 아니다.
경전은 짧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여하튼 처음 <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가 대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처음 <이 경전의 내용>을 대한다.
그리고 다음을 요구받게 된다.
먼저 <무상ㆍ고ㆍ공ㆍ비아> 등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올바로 관한다.
한편 지금까지 세상에서 <애착을 가졌던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모두 끊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의 첫 출발단계>가 된다.
<생계를 위해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살면서 애착을 갖는 것>이 있다.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명예...등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체가 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두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애착>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당장은 <약간의 좋음>을 준다.
그 대신 그로 인해 <많은 업>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후 긴긴 시간 <많은 괴로움>을 얻게 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로부터 <좋음>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착>을 여전히 버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애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애착>을 버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한다.
지금까지 <망상분별>에 바탕하여 임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명예>...에 집착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에 <애착>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애착과 집착>을 버린다고 하자.
그런 경우 <애착>을 갖는 것이 없어져도 무방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런 상태를 <집착>을 버린 상태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에 <애착>을 버린다고 하자.
그러면 곧 <애착했던 정도>에 비례해 <상실감>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무력>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망연해 한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도 된다.
자신이 <지금껏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이 있다.
<자기 자신>, <자신의 것>, <세상의 일체>가 그런 것이다.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다.
이에 대해 <애착>을 버린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대신 자신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이렇게 <걱정>하고 망연해진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마약을 끊는 것>을 어려워하게 된다.
마약은 <자신의 몸>을 점점 해친다.
그런데 당장은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매순간 <그것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그러면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여긴다.
<수행>의 상황이 이와 마찬가지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자신>과 <자신의 것>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집착과 번뇌>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고통>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생명을 구제하는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따르기 어려워한다.
한편, <애착과 집착>을 버린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수행>을 계속 정진한다.
그런 경우 도대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를 얻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수행>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것은 <일반의 삶>과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기에 그렇게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스스로에게도 <수행>은 무익한 일로 느껴진다.
또 <다른 이>들도 역시 그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행>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을 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미 이에 관련하여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폈다.
그러나 <수행>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수행의 목표>의 <가치>
불교의 <수행목표>는 <고통스런 현상>을 제거해 없애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야 한다.
나아가 장차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번뇌>도 제거한다.
그래서 <안온한 해탈>과 <열반>을 얻는다.
이런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이번 <생에서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다.
<무한한 시간>에 걸친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소멸시킨다.
이런 데에 <1차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맑고 밝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도 <윤회의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탈]
더 나아가 다른 생명도 <그런 묶임>에서 모두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광대무변한 서원>을 일으켜 실천해간다.
그리고 <지혜와 복덕>을 원만히 성취한다.
그래서 <안락한 니르바나>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수행 목표 상태>는 <일반 현실>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수행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현상 일체> <색ㆍ수ㆍ상ㆍ행ㆍ식>에 대하여 올바로 관해야 한다.
즉, 이들 현실내용 일체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다.
<이런 사정>을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를 제거한다.
그리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
다만, <애착을 갖는 것>들에 대해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참된 모습>을 모두 올바로 관하기는 쉽지 않다.
불교에서 <윤회>나 <무상ㆍ고ㆍ공ㆍ비아>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일반적인 경우> 윤회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런 <일반적인 입장>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윤회를 전제한 상태>도 살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의 효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의 <현실에서의 가치>
<현실 생활>에서 <가치>가 적은 것이 있다.
그런데 자신이 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경우 <그 가치가 크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또는 <그것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크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우선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다음처럼 가정해 보자.
자신이 별로 가치 없는 <어떤 천 조각>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 그 <천 조각>이 바람에 날려 길가로 떨어진다.
이런 경우 그것을 주으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치가 없는 <천 조각>을 얻을 수 있다.
그 대신 가치가 큰 <자신의 신체>나 <생명>을 희생당한다.
<이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이 이와 마찬가지다.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적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에 <집착>을 갖고 추구한다.
그런 나머지 대신 <훨씬 가치가 많은 것>을 희생시킨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명예> 등이 그와 같다.
이러한 것을 평소 탐하여 추구한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시킨다.
<생명>은 이런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
<생명>은 우주를 포함하여 <그 어떤 수단들>보다 훨씬 소중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고통>이 계속된다.
그런 경우 <그 소중한 생명>마저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보통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심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평안하고 안온한 행복>을 누린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명>을 포기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상태>는 <단순히 생명 있는 상태>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다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평안하고 안온한 행복>을 <다른 생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선>을 실천한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갖춘다.
그래서 선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는 이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들 <각 가치의 내용>들에서,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뒤의 내용>이 갖는 가치가 <앞>보다 더 낫다고 보게 된다.
이 각각은 <그 비율>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보다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우주의 재산>이나 <지위>를 다 갖는다고 하자.
그래도 <자신의 신체>나 <생명>과 이를 바꾸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명이 갖는 가치>를 1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그러면 1000조의 <재산이나 지위>는 얼마라고 숫자로 표시할 것인가.
0.0000000........1과 같이 산수로서 그 비율을 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은 그 정도로 <작은 가치>를 갖는다.
이를 <비유>로 말해보자.
<자신의 생명이 갖는 가치>를 <옷>에 비유해보자.
이런 경우 1000조의 <재산이나 지위>는 <옷에 붙은 실오라기>나 <티끌>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반대로 <자신의 생명>이 갖는 가치가 <우주>보다 더 가치 있다 여긴다.
그런 경우 이제 그것을 <화폐>로 표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100000000........원과 같이 산수로서는 <그 비율>을 표시하기 힘들다.
그 정도로 <큰 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이 <여러 가치>들을 비교한다고 하자.
그러면 <각 단계의 내용>들은 <그 이전의 것>보다 <훨씬 높은 서열>을 갖는다.
그래서 <뒤의 단계>가 갖는 가치는 <앞의 내용>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그 비율>은 산수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에 집착한다.
그에 <관심과 초점>을 맞춘다.
그 뒤에는 그에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눈>이 가려진다.
그리고 <그 집착>으로 인해 <그 가치>에 대해서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
<가치가 적은 것>을 놓고 마치 <큰 가치를 갖는 것>처럼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를 <잘못된 방안>으로 추구해가게 된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명예>..등에 강한 집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온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
<평안한 행복>은 본래 <그런 수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내려고 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렇게 얻지 못한다.
또 이로써 <악>을 행한다.
이는 모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에 바탕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집착>한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 과보로 <고통>을 되돌려 받게 된다.
<각 생명>은 길고 긴 시간에 걸쳐 이를 반복한다.
일반적으로 <집착>을 갖고 임한다.
그런 경우 그 <집착>을 갖는 것은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잃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악>을 행한다.
그리고 긴긴 시간 <고통> 속에서 묶인다.
한편, <집착을 가진 이>는 그것이 성취되어도 또 다른 것에 <집착>을 갖는다.
또 뜻이 성취되어도 다른 것에 <집착>을 갖는다.
그래서 그것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불안>해하며 살아간다.
또 <집착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역시 <집착한 정도>에 비례하여 <강한 슬픔>과 <고통>을 겪는다.
이에 반해 <집착>을 갖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모든 경우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자신이 크게 <애착>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큰 사고>가 있게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큰 고통>이나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된다.
<이런 현실>과 사정이 같다.
현실에서 <집착>을 버리고 생활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집착>으로 인해 <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악>을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 없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다.
그런 가운데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이는 본래 <그 모든 수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한 내용이다.
그런데 <집착>을 버림으로써 <그런 최종 상태>에 쉽게 이르게 된다.
<그 수단>들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집착>을 버리고 수행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수행>이 갖는 작은 효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것에 대해 <집착>을 버린다.
그래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용>이 남아 있다.
즉,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 <목숨>, <신체>나, <재산>, <가족> 등이다.
이들에 대해 <집착>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경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앞에 나열한 문제>를 갖게 된다.
즉, 그런 <애착과 집착> 때문에 <업>을 행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이에 묶이어 끌려 다니게 된다.
불교에서는 <생사>에 대한 <집착>을 버림을 강조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 사정은 다음에서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윤회>를 전제로 한 <수행>의 가치
<자신>과 <세계>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로 관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관한다.
그런 경우 <앞>과는 또 다른 내용을 보게 된다.
현실에서 <자신>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집착>해 대하는 것이 있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내용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
그래서 이들은 잠깐 <좋음>을 주고 <긴 고통>을 불러 가져온다.
또한 그 실재는 <공>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재의 나>나 <실재의 대상>이 아니다.
또 <영원불변한 참된 진짜의 내용>들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관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 내용>은 집착할 만한 <실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윤회>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보게 된다.
즉, 자신이 지금껏 <자신으로 여기고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로 여긴 내용이 있다.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정신> 안에 <들어온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정신)이다.
그리고 <자신의 실재>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한편, <생사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자신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근본정신>(아뢰야식)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에 따라 다시 <생사윤회>를 겪어 나간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단지 <현재의 생>만 고려하던 경우와 <사정>이 달라진다.
<한 생> 안에서 <생명>의 가치가 크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고통이 없는 상태>가 더 가치가 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생명을 해치지 않는 상태>가 가치가 크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온한 행복>을 <다른 생명>에게 나누어 주는 <선>이 가치가 크다.
그리고 <그런 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가치가 크다.
<무한한 기간> 윤회 하는 동안 <한 생명>이 <생사>를 이어간다고 하자.
그런 경우 <어떤 상태>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은가.
그리고 어떻게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과 선>을 실천하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이를 살피게 된다.
100년을 기준으로 한 <한 생>의 가치가 크다.
1000년, 10000년, 1000.....................년
1겁, 10겁...이런 식으로 이어나간다.
더 나아가 <무한>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앞의 기간>도 <찰나>에 가깝다고 하게 된다.
<한 생>에서의 <생사>에 집착한다고 하자.
그래서 <나머지 기간>의 가치를 잃는다고 하자.
그러면 곤란하다.
<윤회>를 전제로 하여 <이 차이>를 보면 그 차이가 크다.
<현실>에서 <자신>과 <자신의 것>에 <집착>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잠시간 현생에서 그 <집착>대로 좋음을 얻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로 인해 <현생>에서도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장 <생사고통>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다시 기나긴 <윤회의 고통>을 받아나가게 된다.
반면, <집착>을 버린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생>에서도 <업>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죽어서도 긴긴 <생사고통의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평안한 <니르바나의 상태>에 머무른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얻는 차이가 크다.
<윤회>와 관련해 이를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차이>는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것이 <수행>이 갖는 <효용>이 된다.
[반복]
>>>
♥Table of Contents
▣● <무상ㆍ고ㆍ공ㆍ비아>와 <수행목표 상태>의 관계
<수행목표 상태>는 <일반 현실 상태>와 일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 <일체에 대한 근본판단>과 관련해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처음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수행목표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일체>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수행으로 <심해탈 상태>가 된다.
그리고 <해탈지견>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무상ㆍ고ㆍ공ㆍ비아>' 아닌' 상태가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심해탈>이나 <열반> 상태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 상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무상ㆍ고ㆍ공ㆍ비아>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처음 제시한 내용은 <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한편, <해탈>과 <열반>도 <일반 상태>처럼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면 <수행목표 상태>는 <일반 현실>과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갖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런 전제에서 다시 <다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수행목표>와 <염리, 희탐진>
<심해탈> 상태가 되어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상태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다.
따라서 다시 <염리 희탐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즉, <수행목표 상태>도 <현실 내용>처럼 역시 싫어하고 떠나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 수행의 <근거>
<심해탈>에 이르러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일반 현실>과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 수행을 통해 <심해탈>을 굳이 얻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수행>은 <일반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어야 이를 행할 필요성이 있다.
불교를 처음 대할 경우 이런 <여러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
[반복끝]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는 <무상ㆍ고ㆍ공ㆍ비아>(무아ㆍ무자성)다.
이런 내용은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마음의 해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
다만 <무상ㆍ고ㆍ공ㆍ비아>(무아ㆍ무자성)은 일체에 적용된다.
때문에 <수행 목표> 상태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수행목표>도 결국 현실에서 행하고 성취한다.
때문에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무아ㆍ무자성)라고 해야 하는가.
그런데 <수행목표를 성취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일체가 <무상ㆍ고ㆍ공ㆍ비아>(무아ㆍ무자성)라고 제시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이 된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무상과 고>는, <현상>을 현실에서 얻는 <현상의 측면>에서 살핀 내용이다.
<공과 무아>는, <현상>을 <실재>와 <실체의 측면>에서 살핀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서 일단 <무상과 고>의 내용과 <공, 비아>(무아ㆍ무자성)을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무상, 고>와 수행목표로서 <해탈>과 <열반>의 성격
*pt* 시작 to k0650sf-- ♠무상과 고의 관계성
<현실 일체>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생멸하는 현상 일체>를 <고통>으로 본다.
그런 가운데 <무상과 고>와 <수행목표>의 관계를 살핀다.
그런 경우 수행목표인 <해탈>과 <열반>의 성격에 대해 살펴야 한다.
삶에서 <고통>이 문제된다.
따라서 <수행>은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제거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고통>의 정체를 자세히 살핀다.
살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고통이다.
그러나 <당장 좋음으로 느끼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그에 <집착>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로 인해 역시 <고통>을 받게 된다.
한편 생사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자.
그래도 <근본정신>은 계속 다음 <생>을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쌓여진 <업장>과 <망집 번뇌>가 상속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생사윤회>를 <무량겁>에 걸쳐 받아나가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당장 <좋은 부분>만 떼어내 살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인과로 <다른 생사고통>과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생멸하는 현상> 일체는 모두 <고통>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무상한 생사현실>에는 <생사고통>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들 무상한 일체>는 <고통>에 귀결된다.
이런 내용이 <무상, 고>의 판단이다.
그래서 <고통>의 내용을 살핀다. [고제]
그리고 다시 <고통의 원인>을 살핀다. [고집제]
그리고 <고통>이 모두 <소멸>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상태>[고멸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얻을 수행 방안을 살핀다. [고멸도제]- 4 성제
따라서 <수행 목표>인 <해탈>과 <니르바나>(열반)은 <모든 고통>과 <악>이 소멸되는 상태다.
이런 점에 의미가 있다.
<일반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고통>과 <악>을 제거하려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일반적인 목표>와 공통된다.
생사현실 가운데 <좋음>과 <나쁨>이 섞여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생사현실> 가운데 삶에서 추구할 <좋음>이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고통>을 제거한다고 해도 <생사현실> 안의 일부의 <고통>만을 제거하고자 한다.
한편 고려하는 기간도 <1생>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통>을 제거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1생> 안에서 임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거나 제거함에 목표를 둔다.
그러나 불교는 <망집>에 바탕해 대하는 <'현실 일체>'가 <고통>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또한 <망집>에 바탕한 경우 무량겁에 걸쳐 <3계 6도>를 생사윤회하며 <생사고통>을 겪게 됨을 제시한다.
그런 가운데 근본적으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남을 수행 목표로 둔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불교에서는 <해탈>과 <열반>을 목표 상태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런 <불교의 목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 <여러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무상한 가운데에는 <즐거움>도 있다.
그런데 모두를 <괴로움>이라고 보아 부정하는 사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또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래서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하자.
그런데 <열반>이나 <해탈>이 목표상태다.
이 경우 <열반 해탈>은 이런 일체를 떠나 <어떤 상태>에서 구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생사현실 일체>를 <고통>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생사현실 일체>가 <니르바나>라고도 제시한다.
그런데 <니르바나>는 <고통>이 사라져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
처음에는 현실이 모두 <괴로움>이라고 제시해 살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 그대로가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시한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어떤 상태>를 향해 수행하는가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현실>이 정말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에서 그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쉽다.
이런 경우 <불교 수행 방향>을 잘못 잡기 쉽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 상태>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먼저 <생사현실>과 <생사고통>의 정체를 올바로 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사현실의 고통>은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해 나타난다.
즉 한 주체가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망집 번뇌>를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을 출발한다.
그러면, 그는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색ㆍ수ㆍ상ㆍ행ㆍ식]
그런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런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근본원인>은 이런 <망상분별과 집착>이 근본 문제다.
<본바탕 실재>에서 우선 그가 생각하는 <자신> 및 <세상의 어떤 A>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 생멸>이나 <생사고통>도 얻을 수 없다.
<생사현실> 일체의 본바탕 <실재>는 사정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를 <망집>을 일으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그 <생사현실>에 <자신>과 <세상>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자신의 생사고통>과 <세상의 생멸>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일체 생사현실>을 대하게 된다.
이런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생사현실 일체>는 끝내 <고통>을 가져다준다. [고고, 괴고, 행고]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어떤 좋음>을 취하는 것이 방안이 아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망집>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사고통>을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망집>을 일으켜 <그런 생사고통>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따라서 그처럼 <잘못된 분별>을 행하는 <망집>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망집>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에 바탕해 있다고 여긴 <생사고통>과 <생멸>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즉 본바탕의 <청정한 진여 상태>만 드러나게 된다.
그처럼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칭하게 된다.
그래서 <니르바나>는 생사현실 일체에 본래 갖추어져 있던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없는 상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없는 상태>를 새로 얻는 행위와는 다르다.
그리고 <니르바나의 상태>는 <생멸> 및 <생사고통>을 떠난 상태다.
즉 <망집>에 바탕해 있다고 잘못 여기는 <생멸현상>을 떠난 상태다.
그래서 <현실 내용>처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함>이 아니다.
또한 <고통>도 아니다.
결국 <니르바나>는 <생사현실의 본바탕>에 본래 갖춰져 있는 상태다.
다만 이를 <망집>을 일으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본래 얻을 수 없는> <생사고통>을 그처럼 <있다>고 잘못 여기게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본래 청정한 니르바나의 상태>를 <생사고통>의 <생사현실>로 잘못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는 <그 생사현실 일체>가 <고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망집>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면 <망집>이 제거되면서 <본바탕의 청정한 진여 니르바나>가 드러난다.
처음에는 현실이 모두 <괴로움>이라고 제시해 살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 그대로가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시한다.
<그 사정>은 위와 같다
그것은 결국 <망집에 바탕해 대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에 <생멸>과 <생사고통>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대하는 <생사현실 일체>는 <고통>에 귀결된다.
그러나 <망집>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얻을 수 없는> <생멸>과 <생사고통>을 있다고 잘못 여기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생멸>과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또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니르바나>라고 제시하게 된다.
결국 <수행>이란 <망집>을 일으킨 상태에서 이런 <망집>을 제거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무상>한 것은 왜 <고통>인가?
세상에는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다.
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도 있다.
부처님도 출가 이전에 왕자로서의 <향락>을 누린 바 있다.
그래서 삶 안에는 <즐거움>이 들어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다.
경전에서도 감수에는 <즐거운 느낌>이 있음을 밝힌다.
...
수[느낌]에는 세 가지 감수[三受]가 있다.
괴로움[苦受], 즐거움[樂受],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不苦不樂受]의 느낌들이 있다
...
(『잡아함경』 0298. 법설의설경과 0466. 촉인경 등)
생사현실은 <변화>한다.
<영원하지 않다>.
현실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런 <세 가지 감수>를 얻는다.
그래서 <괴로움>도 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있다.
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상태>'도 있다.
그런데 <무상>한 것은 <모두> 곧 <괴로움>이 된다고 부처님은 설한다.
<그 사정>이 무엇인가.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색(수ㆍ상ㆍ행ㆍ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我]가 아니다.
그리고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我所]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
(『잡아함경』 0009. 염리경厭離經)
위 경전의 내용에서 '무상하다'는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실내용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모두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괴로움(苦)'은 <괴로움의 느낌, 감수 작용>을 뜻한다.
또는 '일체현상(색ㆍ수ㆍ상ㆍ행ㆍ식)은 <괴롭다>'라는 가치판단도 뜻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체 현실은 <무상>하므로, <괴로움>이라 제시한다.
이는 <다음 사정>이다.
우선 생사현실에서 <괴로움>의 해결이 문제된다.
따라서 부처님은 <고통이 완전히 제거 소멸된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고제-고집제-고멸제-고멸도제>라는 <4성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일체 현상(색ㆍ수ㆍ상ㆍ행ㆍ식)을 <괴로움>이라고 보는 것은 다음 사정이다.
<당장 괴로움을 주는 내용>이 있다.
이는 <그 자체>가 괴롭다.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고고]
한편 세상에서 <좋다>고 보아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하지 않다>.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 <괴로움을 주는 것>이 된다. [괴고]
한편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행고]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 일체>는 모두 <괴로움>과 관련된다.
결국 생사현실은 그것이 <무상>한 이상 <괴로움>과 관련된다.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한편, 괴로움의 <감수현상> 자체는 <변화>를 바탕으로만 얻어진다.
즉, 괴로움[고]은 그런 <무상함>[변화]을 바탕으로 한다.
<무상>하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감수현상>도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런 경우 <고통>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무상>하다.
그래서 <고통>도 얻게 된다.
그래서 <무상>과 <고>는 서로 간에 <연기(縫起) 인과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무상>하므로 <고>라고 제시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현실을 모두 즐거움으로 본다는 반대 주장
일체는 <무상>하다.
따라서 <고통>이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주장>이 가능하다.
앞의 명제들을 전부 <즐거움>과 관련시켜 적용한다고 하자.
그러면 위 내용을 모두 반대로 제시할 수도 있다.
즉,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 현상이 즐거움을 준다.
따라서 즐거움이다.
당장 <괴로움을 주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언젠가는 무너져 사라진다.
따라서 즐거움을 준다.
당장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은 그것이 변화한다.
따라서 언젠가 즐거움을 주게 된다.
이처럼 모두 반대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즐거움이란 감수작용>도 역시 변화[무상함]를 바탕으로 얻어진다.
무상하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감수현상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즐거움도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무상함이 있다.
따라서 즐거움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무상과 즐거움은 서로 간에 연기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무상하므로 즐거움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을 긍정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불완전한 좋음>을 취하게 한다.
즉 <그런 좋음>은 끝내 고통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고통을 얻는 일시적 징검다리>를 집착해 취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는 근본적으로 <생사고통>을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다.
♥Table of Contents
▣- 비관주의와 불교의 차이
현실에는 <좋음>과 <나쁨>이 섞여 있다.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다
그러나 불교는 이들 현실 일체를 모두 <괴로움>으로 본다. [일체개고]
즉, <괴로움>은 나빠서 나쁘다. [고고]
그리고 <즐거움>도 그것이 <무상>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괴롭다고 관한다. [괴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상태>도 있다.
그래도 이는 변화한다.
그래서 괴로움을 겪게 된다.[행고]
이처럼 본다.
생사현실에는 <좋음>과 <나쁨>이 섞여 있다.
그런데 <비관주의>는 그 가운데 오직 나쁜 측면만 찾아 초점을 맞추려 하기 쉽다.
또 <허무주의>는 생사현실 일체를 부정하기만 하는 경향을 갖기 쉽다.
그런데 <불교의 입장>을 <비관주의>나 <허무주의> 입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를 살펴야 한다.
<불교>는 특별히 모든 것을 나쁘게 대하려는 입장이 아니다.
또한 불교는 현실에서 단순히 <나쁜 측면>만 찾아 초점을 맞추려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불교는 단순히 <현실 일체>를 부정하려는 입장이 아니다.
불교는 상사현실 가운데 <생사고통>과 <그 원인이 되는 망집과 업>을 문제삼는 것이다.
또한 <망집에 바탕해 대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사현실 가운데 생사고통과 그 원인을 제거하는 <수행>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사현실 가운데 <무량한 선법>을 닦는 일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행하는 <올바른 수행>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에 바탕해 대하는 현실을 긍정한다.
그래서 단순한 <비관주의>나 <허무주의> 입장과는 다르다.
<한 주체>가 <현실>에서 임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그가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집>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런 경우 <자신이 얻은 내용>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망상 분별>에 바탕해 이를 <집착>한다.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무한한 고통의 생사윤회>에 묶이게 된다.
그리고 그처럼 망집에 바탕한 <그 현실 일체>는 모두 <괴로움>에 귀결된다.
이런 <생사고통>은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에서의 문제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방치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이런 현실 상태>를 긍정할 도리가 없다.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현실 상태>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안주>한다.
그리고 그건 망집에 기초해 <좋은 면>을 찾아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나쁨>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다.
따라서 먼저 이런 사정을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생사고통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는 <좋음>과 <나쁨>이 섞여 있다.
그런 가운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좋음>을 집착한다.
그리고 이를 추구한다.
한편 <망집>을 바탕으로 낙관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자.
그건 경우< 망집>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좋음>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래서 <비관주의>와 정반대 방향으로 현실을 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잠시간의 좋음>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망집에 바탕한 좋음>은 나쁨을 그 안에 갖고 있다.
또 이는 <인과상>으로도 나쁨이 그에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얻는 과정>에도 나쁨이 들어 있다.
그리고 장차 <그 과보>로 나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더 많은 나쁨과 고통을 받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좋음>은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징검다리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결국 <망집에 바탕한 좋음>은 이런 결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는 <불완전한 좋음>이다.
그래서 이는 <이상적인 목표 상태>로 볼 수 없다.
이를 이야기를 통해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사람이 지옥에 붙잡혀 갔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르고 억울하다고 말한다.
자신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끈>이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갔다.
그런데 그 끈에 묶인 <소>가 따라왔다.
그리고 그 뒤에 <소 주인>이 쫒아왔다.
그리고 자신을 때렸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자신이 지옥에 잡혀 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염라대왕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하겠다.
여기서 끈을 좋다고 보고 가져간 것이 문제다.
즉 <그런 생각>과 <손>만 문제다.
그래서 그것만 잡아끌고 왔다.
그런데 네가 몽땅 여기까지 함께 끌려 온 것이다.
...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해 실로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좋음>에 집착한다.
그러면 <그 집착>을 따라, 지옥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기 곤란하다.
위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나타낸다.
결국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 안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먼저 <생사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잘 관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잠재된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괴로움>이란 문제현상을 직시한다.
이 경우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게 하는 요소들이 문제된다.
생사고통은 그가 망집 번뇌에 바탕해 행하는 <업>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먼저 <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쌓은 <업의 장애>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업을 행하게 만드는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업을 행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망상분별에 바탕한 번뇌>와 <집착>이다.
그래서 이는 생사고통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는 고통임을 제시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직시해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래서 이는 현실에서 무조건 <나쁜 부분>만 찾아내 초점을 맞추려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조건 나쁘게 관하는 <비관주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는 <현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망집번뇌>와 <집착>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행>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수행>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게 하는 측면>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현실 일체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와는 다르다.
더욱이 <깨달음 >을 통해 <망집>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 일체>는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중생은 망집을 일으켜 <본래 얻을 수 없는생사고통>을 실답게 겪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중생에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보리심>에 바탕해 <중생제도>와 <성불>의 <서원>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른 중생>을 생사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생사현실>에 중생과 함께 임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중생제도를 위해 <무량한 수행문>을 닦아 나가게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무량한 선법>을 닦아 나간다.
그리고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불국토>를 장엄한다
그리고 <법신>을 중득해 부처와 같은 <이상적인 상태>를 성취한다.
그리고 불교 수행은 <생사현실>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향한다.
그리고 <이 모든 수행>을 <생사현실> 안에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 현실> 안에서보다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한다.
결국 불교는 무조건 <생사현실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Table of Contents
▣○ 일반의 경우와 불교의 목표의 차이
*pt* 시작 to k0020sf-- ♠○일반의 경우와 불교의 목표의 차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좋음>을 추구한다.
그리고 <고통>을 제거하고자 한다.
불교에서도 <좋음>을 추구한다.
그리고 <고통>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서로 다르다.
<세속의 입장>과 <수행>이 차이가 나는 사정이 있다.
이를 이미 처음에 살폈다.
(참고 ▣- 수행으로의 전환 계기)
이를 다시 대강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 가치가 <적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가치가 <보다 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가치가 <큰 것>을 놓친다.
가치가 <적은 것>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가치가 <큰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자세가 현명하다.
그런데 한 <정지된 단면>을 대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가치판단>을 잘 행하지 못한다.
<그 사정>이 다양하다.
우선 여러 사유로 <외관>에 내용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장 느끼게 되는 <감각, 느낌>에 치중한다.
그리고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초점 밖에 잠재되어 있는 측면>들은 무시하게 된다.
한편 <인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인과로 묶인 <과거>와 <미래의 내용>도 무시된다.
한편 <시장에서 표시되는 가격>에 치우쳐 가치판단을 행한다.
그리고 <명확히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무시한다.
이런 여러 현상들로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판단>을 행한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는 판단이 더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잘못된 방안>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좋음에도 <단순히 좋음>과 <'좋고 좋음'>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자신>에게 <지금 당장> <이 측면>에서만 좋음을 주는 내용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어떤 좋음>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자신>도 좋고, <남>도 좋고, <온 생명>이 차별 없고 제한 없이 좋다.
그리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오래오래 무궁하게> 좋다.
그리고 <이 측면>도 좋고, <저 측면>도 좋고, <두루두루 모든 측면>에서 좋다고 하자.
<단순히 좋음>과 <'좋고 좋음'>의 차이는 <단순한 고락>과 <선악>의 차이에 상응한다.
이 <두 내용>은 차이가 크다.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일단 <자신>이 <당장> <초점을 맞추는 측면>에서 좋아하는 상태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를 뜻대로 성취해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좁고> <짧고> <얕게> 관찰하여 좋음을 추구한다.
한편 사람들은 주로 <현실의 생>에 국한해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이 없는 상태>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가치 판단>을 행한다.
그리고 <집착>을 갖고 추구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 자신은 <가치 없는 생>을 살아가게 된다.
또 이로 인해 <다른 이>들도 <고통>을 받게 한다.
또 이로 인해 자신도 <긴긴 시간> 윤회의 생사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이는 <잠시간> 좋음을 얻고 결과적으로 <긴긴 시간> 고통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일종의 <삶의 덫>에 빠진 상태가 된다.
<현실에서 설정하는 목표>는 이런 상태다.
그리고 이런 사정 때문 부처님은 <이런 희망>을 모두 제거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와 다른 상태를 <수행 목표>로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 인과상 나쁨의 결과를 가져오는 좋음
하나의 생 안에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윤회 과정>에서도 <하늘>과 같은 <좋은 상태>도 있다.
그것만 떼어 보면 좋음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시적 좋음>에 집착한다.
그러나 하나의 현상은 <그 원인>과 묶여 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그 결과>와도 묶여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같이 묶인 <종합세트>와 같다.
통상 이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어느 하나>만 취하려 한다.
그리고 <나쁜 다른 것>은 모두 빼내려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행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모두>를 함께 받게 된다.
<망집>에 바탕해 <어떤 좋음>을 집착해 구한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런 경우 다른 주체와 <가해 피해관계>가 나타난다.
그런 경우 그런 뜻을 <성취>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뜻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무너진다.
그리고 그 좋음은 다시 징검다리가 되어 <다른 고통>을 받게 한다.
그런 <업>으로 인해 또 다른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은 바로 이런 사정으로 받아간다.
따라서 이 모두를 <고통>이라고 묶어서 관해야 한다.
결국 <이 전체 상황>이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목표>로 추구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이런 생사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은 <일반 입장>과 <차이>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좋음>을 얻는 기간의 문제
일반적으로 삶이 <한 생>만으로 끝난다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한 생>만 고려하고 삶을 계획한다.
그래서 <인과관계>도 짧게 관한다.
그러나 <근본정신>은 <생사과정>에서 계속 이어진다.
한 주체가 <망집>을 일으켜 임한다.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해 <무량겁>에 걸쳐 <생사윤회>를 겪게 된다.
그리고 한번 행한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보>를 <무량겁>에 걸쳐 받게 된다.
그래서 <수행>과 <일반인의 입장>이 서로 달라진다.
세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왕의 지위>다.
현실에서 세속의 사람들은 대부분 <왕위>를 부러워한다.
부처님은 이런 <왕위>에 오를 왕자였다.
그러나 이는 <생사윤회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한다.
부처님은 <삶의 문제>를 이처럼 관했다.
그리고 <출가>를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사람들이 작은 <번뇌>와 <고통>의 해결에 집착한다.
그런 경우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으로 좋다고 여긴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상태>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또 그에 대해 <번뇌>를 일으켜 갖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한다.
이 경우 <생계>만 해결된다고 하자.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 받는다.
그런 경우는 그 <질병>만 해결된다고 하자.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무한히 나아가도 마찬가지다.
나쁜 방향으로 무한히 나아가도 마찬가지다.
또 좋은 방향으로 무한히 나아가도 마찬가지다.
앞과 같은 관계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처음보다 <훨씬 나쁜 상태>가 많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중환자 상태>도 있다.
그래서 자신 혼자 소대변도 보기 힘들다.
또는 현실적으로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극심한 기아>와 <빈곤>에 처한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태도 있다.
이는 앞의 상황보다 훨씬 심하다.
한편 이보다 좋은 상태도 많다.
예를 들어 <생계>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큰 재산>을 갖고 건강하게 산다.
또한 나라 전체가 <풍요>롭게 살아간다.
대부분 걱정이 해결되어 <안락>한 상태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도 <해결할 문제>는 수없이 생겨난다.
그리고 <번뇌>도 마찬가지로 일으킨다.
다만 주체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뿐이다.
<고통>의 정도가 <지옥>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즐거움>의 정도가 <하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번뇌>를 일으켜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그런 <실질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 <생사윤회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걸쳐 수많은 상태가 있다.
무한한 기간을 놓고 <생사 윤회과정>을 살핀다.
그러면 이들 3계가 전체적으로 고통의 문제에 처해 있다.
현실 일체는 <무상>하다.
그리고 이 일체는 모두 <괴로움>에 귀결된다.
<하늘의 수명>은 대단히 길다.
사람이 상상하기 힘들만큼 길다.
그래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
또 그로 인해 <다른 고통>을 받게 된다.
『타화자재천경』에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
<타화자재천의 수명>은 1만6,000년이다.
그런데 어리석고 들은 것이 없는 무식한 범부들은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지옥ㆍ축생ㆍ아귀 가운데에 태어난다.
그러나 많이 들어 아는 것이 많은 거룩한 제자들은
거기서 목숨을 마치더라도
지옥ㆍ축생ㆍ아귀 가운데에는 태어나지 않느니라.
...
(『잡아함경』 0863. 타화자재천경他化自在天經)
이처럼 욕계 하늘의 수명도 대단히 길다.
그런데 다시 <색계 무색계의 하늘의 수명>은 다시 이보다 숼씬 길다.
불교에서는 대단히 긴 시간 단위로 <겁>이라는 시간단위를 사용한다.
이런 <겁>이라는 시간단위는 상상하기 힘든 매우 긴 시간이다.
그런데 <색계 무색계의 하늘의 수명>은 이런 겁을 단위로 헤아린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이를 <무한한 시간>과 비교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는 늘 <찰나의 순간> 쪽에 가깝다.
예를 들어 3은 1보다는 큰 수다.
그러나 이를 9에 비교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3은 9보다는 1쪽에 가깝다.
이와 사정이 마찬가지다.
<1겁이란 긴 시간>도 <무한>에서는 오히려 <찰나의 순간> 쪽에 가깝다.
어떤 좋음을 오래 기간 얻는다.
그래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
그리고 이후 <무한한 시간>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문제다 .
이는 현실에서의 경우와 사정이 같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잠시> 유희를 즐기며 좋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해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후 <남은 생>을 불구 상태로 <긴 고통>을 받는다고 하자.
<생사윤회> 과정에서 <한 생의 좋음>도 길게 보면 이런 경우와도 같다.
<어떤 좋음>을 얻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 모든 경우 그처럼 <장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오래오래> 좋은 상태를 향해야 한다.
그것이 곧 수행방안이다.
(『잡아함경』 0863. 타화자재천경他化自在天經)
따라서 부처님은 단지 <생사윤회> 과정에서 <하늘에 태어남>만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는다.
즉 <한 생의 좋음>만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를 전체적으로 문제 삼는다.
그런 가운데 <생사윤회> 과정 전반에 걸친 <생사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 <일시적인 좋음>의 문제
<물>에 빠졌다.
그런 상태에서 잠시라도 <물 밖>으로 몸을 내어 숨을 쉬고자 한다.
그런 경우 이는 물 속에서 <숨을 못 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또는 바람이 빠지는 <튜브>에 잠시 몸을 싣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잠시간 좋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사정으로 <물에 빠진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조차도 목표로 삼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물에 빠진 <전체 상황>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물에 빠져 있는 이상 위 어느 경우나 문제다.
그래서 이 일체는 <고통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좋다고 여기는 상태가 있다.
이런 경우도 위와 같다.
대부분 <당장의 좋음>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관계>도 일일이 이해하지 못한다.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처님도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다음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몸에 난 <종기> 하나로 고통 받는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자.
그러면 삶에는 문제가 없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기만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의사를 찾는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다음처럼 말한다.
<몸>도 <영원>하지 않아 결국 무너진다.
그 <몸>이 무너진다고 하자.
그러면 역시 현재의 <종기>처럼 큰 고통을 안겨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몸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처방을 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누구나 우선 놀라게 된다.
<종기>의 치료만 원했다 .
그런데 그 고통을 없애려고 <몸>을 없애고 죽으라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삶에서 <생사고통>이 문제된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해결을 원한다.
그런데 생사현실 일체에 <집착>을 버릴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회신멸지> <무여열반>을 목표로 수행할 것을 제시한다.
그런 경우 앞과 같은 상황과 비슷하게 여기게 된다.
일반사람들은 <종기>만 문제로 본다.
그리고 <몸>은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미처 보지 못한 것뿐이다.
<종기>도 문제다.
그러나 <몸>도 문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시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
부처님은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각 주체는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처음 <망집>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래 없다. [무아]
현실에는 <좋음>과 <나쁨>이 섞여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음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나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생멸하는 현상>이다.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 현실 일체는 <영원>하지 않다.
이들은 <무상>하다.
그래서 그것은 끝내 무너지고 사라진다.
그런 이상 그 일체가 결국 <고통>에 속한다. [일체개고]
즉 <색ㆍ수ㆍ상ㆍ행ㆍ식> 일체가 다 <고통>과 관련된다.
그러나 중생들은 <망집>에 바탕해 이에 집착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명예>, <지위> 등에 집착한다.
그리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러면 <몸>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집착하는 바>도 일부 성취할 수 있다.
그래도 <괴로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업>으로 인해 다른 주체와 <가해 피해관계>에 얽히게 된다.
이것이 <업의 장애>를 일으킨다.
한편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멸관>을 취한다.
즉, 이번 한 번의 생으로 <삶>을 마친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데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과정에서 <근본정신>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쌓여진 <업>과 <망집번뇌>에 바탕해 <3계 6도>에서 <생사윤회>를 겪게 된다. [윤회]
그런 가운데 장구하게 <생사고통>을 겪는다.
이는 <이익>이나 <안온한 즐거움>을 오래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해 얻는 <생사현실 일체>가 고통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망집>을 일으켜 집착한 만큼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를 <5음성고>로 표현하여 제시하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고통>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문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망집>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임시방편>에 그치게 된다.
그리고 <불완전한 해결책>이 된다.
예를 들어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런 경우 <섬>에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에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목표로 해야 한다.
<바람 빠지는 튜브>는 단순히 잠시간의 <임시방편>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런 튜브>를 목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사현실>의 <정체>와 <사정>을 올바로 관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먼저 <진리>를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먼저, <일반적 입장>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일반적인 입장>은 몸에 난 <종기>만 문제로 본다.
물론 몸에 <종기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임을 관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삶>도 문제임을 관해야 한다.
<종기>는 당장 고통을 준다.
그래서 <문제>다.
그러나 <망집>에 바탕에 임한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이 역시 <생사윤회>과정에서 장차 <고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문제>다.
또 현실에서 얻는 <많은 좋음>을 얻는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생사과정>에서 <고통의 과보>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이 역시 <문제>다.
또 심지어 <하늘>도 문제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하늘은 <복덕>이 많다.
그리고 <수명>도 길다.
그래도 문제다.
세상은 <3계 6도>다.
그리고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다.
그리고 이런 <생사현실 일체>는 <무상>하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그것이 <일정 기간> <좋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장구한 고통>을 안겨준다.
따라서 이처럼 일체 <생멸하는 현상>을 <고통>으로 관해야 한다.
그리고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그 본바탕>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공>하다.
본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본래 <니르바나> 상태다.
이처럼 <그 정체>를 올바로 살핀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통해 <현실 일체>는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 일체>에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지위>..등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일체에 대해 <탐욕>과 <집착>을 버린다.
그런 경우 수행 목표인 <해탈> <열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를 성취할 방안>도 올바로 찾게 된다.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관해 집착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해 <집착한 내용>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자신이 그전까지 <집착했던 것>이 있다.
그런 경우 그것을 얻기 전까지 <갈증>과 <불만>, <불쾌>, <고통>에 시달린다.
그런데 이들에 <집착>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다.
또 <무엇을 얻은 상태>에서 이에 <집착>한다.
그런 경우 그것이 <사라질 상태>를 생각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다.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관해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장차 생사고통에 처하게 하는 <업>을 일단 중단한다.
그리고 <업장>을 제거하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 3악도의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런 가운데 근본적인 <망상분별>과 <번뇌>까지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해탈>을 얻는다.
이 경우 <자신의 몸>은 <망집>에 바탕해 취한 것이다.
그리고 <외부 세상>도 그런 <망집>에 바탕해 취한 것이다.
그런데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는 사라진 상태가 된다.
반면, 청정한 <본래의 니르바나>가 드러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벽돌>을 <자신>으로 잘못 이해한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 그런 <잘못된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러면 <잘못된 망상분별>만 제거된다.
그 상황에서 <벽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다.
처음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잘못된 망상분별>만 제거된다.
그래서 <기존의 생사현실> 대부분이 그대로 남는다. [유여의열반]
이런 <생사현실 일체>는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가운데 한 생을 임하는 한 <선천적인 번뇌>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구생기 신견]
그래서 이에 바탕하여 여전히 <감각>, <느낌>, <생각>,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감각현실>이나 정상적인 <관념 분별>도 여전히 얻는 상태다.
이들은 <망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
그러나 <이 자체>가 망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에 임하는 이상 여전히 일정한 <감각>과 <고통>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시 <망상분별>을 일으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런 <생사현실 일체>는 <망식>에 바탕해 얻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참된 진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실답지 않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남은 이상 <완전한 반열반>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후 <망집>을 일으키는 <근본>까지 끝내 제거한다고 하자. [무여의열반]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해 취한 <자신의 몸>도 사라진다.
그리고 망집을 일으킬 재료를 얻어내는 <망식>의 구조까지 제거된다.
그래서 <회신멸지>로 <무여열반>에 든다.
그래서 이후 다시 <망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일정 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얻던 <생사현실>은 더 이상 얻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근본바탕 실재>와 <근본정신>은 남는다.
다만 <망식의 구조>가 제거된다.
그래서 <망집을 일으킬 재료>를 더 이상 일으켜 얻지 않게 된다.
그래서 <완전한 반열반>의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를 <망집 상태>를 기준으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마치 <종기>를 없애려고 <몸>까지 모두 없앤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래의 완전한 니르바나>를 다시 회복해 내는 것이다.
즉,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망집을 일으키는 <재료>도 제거한다.
더 나아가 그런 재료를 얻게 하는 <망식>의 구조도 제거한다.
그래서 <본래의 완전한 니르바나>를 다시 회복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수행의 기본적 목표>가 된다.
다만, <망집>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경우 본래 <생사현실>에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음을 관하게 된다. [<생사 즉 열반>]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이런 <깨달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의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해 평안히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자.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안인 수행>을 성취한다.
그런 경우에는 생사현실에 남아서도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무여열반>에 들지 않고 <생사현실>에 그대로 남아 머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로 <가섭존자>나 <빈두로 존자>와 같은 경우가 있다.
한편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을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중생제도를 위해 오히려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지 않고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경우를 다시 자세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아래에 이어 살펴나가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고통과 <열반>의 관계- 생멸 즉 고통이 없어진 상태로서의 <열반>
불교 수행자는 먼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의 목표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서 <끊어 제거할 내용>을 알 수 없다.
또 수행으로 <나아갈 방향>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정진해 성취할 내용>도 알 수 없다.
현실 일체는 <생멸>한다.
그래서 일체는 <무상>이다.
이런 현실 일체는 <고통>에 귀결된다.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은 다음의 과정으로 처하게 된다.
근본무명 어리석음 → 번뇌 집착 → 업 → 생사고통의 관계가 있다. [혹-업-고]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자신과 외부 세상에 대해 <집착>한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래서 각 주체간에 <가해>와 <피해>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다.
이처럼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집 번뇌>를 일으켜 <업>을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고통>과 <생사윤회>에 묶이게 된다.
그래서 수행의 1차적 목표는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우선 보시를 행하고, 10선법과 계를 성취한다. [인천교]
그러나 생사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시 생사윤회과정에서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 다시 생사윤회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사고통과 생사윤회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3계(三界)의 생사윤회의 묶임과 고통의 결과(苦果)로부터 모두 해방되게 된다.
이를 해탈이라고 한다.
해탈은 속박을 풀고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풀고 벗어날 번뇌의 속박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한편, 이렇게 해탈을 통해 얻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칭한다.
열반은 불어 꺼진 상태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주로 번뇌 등과 생사고통이 사라져 없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기본적으로 성취할 목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후 자신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중생을 도와 생사묶임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행자가 생사현실에서 성취하고 갖춰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
그러나 수행자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망상분별이 가장 근본원인이 된다.
그러나 망상분별의 뿌리가 깊다.
따라서 이를 먼저 제거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단 집착을 제거한다.
그래서 처음 일체에 관해 올바로 판단한다.
무상ㆍ고ㆍ공ㆍ비아(무아ㆍ무자성) 등이다.
그래서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업을 중단한다.
그래서 일단 3악도의 생사고통에서 벗어난다.
이후 수행을 통해 미혹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점차 생사묶임을 벗어나는 수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점차 망상분별을 근본적으로 제거해가게 된다.
다음의 설산동자의 게송은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다.
이는 나타나고 멸하는 현상이다.
나타나고 멸함이 없어지고 나면,
적멸이 즐거움이 된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이는 무상게라는 게송이다.
위 게송에서 생멸이 멸해 없어진 상태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여러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 자성청정열반
본바탕인 실재 진여에서는 생사고통이나 생사 및 생멸 일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 바탕은 본래부터 생사고통이나 생사묶임에서 벗어난 열반이라 한다. [자성청정열반]
이를 열반적정이라고 표현한다.
○ 유여의 열반
본바탕인 실재 진여에서는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생사현실에서 중생이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생사 윤회에 묶인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
즉 각 주체는 처음 근본 무명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망집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이런 각 주체간에 가해와 피해관계로 얽힌다.
이런 상태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이러한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망집 번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고통과 생사묶임에서 벗어난다.
다만 망집의 근원이 되는 몸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를 남음이 있는[有餘依유여의] 열반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생사 고통의 원인을 제거한다.
그리고 고통의 세계로부터 해방된다.
즉, 3계(三界)의 고통의 결과(苦果)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평안한 상태에 이른다. [有餘依涅槃유여의열반]
이런 상태를 성취함이 수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상태다.
○ 무여의 열반
수행자가 이후 망집의 근원이 되는 몸까지 모두 남김없이 제거한다.
또한 정신내 모든 내용을 남김없이 제거한다.
이들은 모두 허망하고 실답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灰身滅智회신멸지]
그래서 더 이상 망집을 일으킬 근본을 제거한다.
그리고 본바탕 진여 실재와 자신의 근본정신만 남겨진다.
그리고 다시 망집을 일으켜 생사현실에 들지 않는다.
그런 경우 이를 남음이 없는[有餘依무여의] 열반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온전히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 상태로 남게 된다. [무여의열반]
○ 생사현실에 임하는 수행방향 - 생사즉 열반
수행자가 열반에 들 수 있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생사현실에는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있다.
그런데 깨달음의 마음(보리심)에 바탕해 생사현실을 관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다음을 관하게 된다.
본래 생사현실에 그런 생사고통은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중생들은 망집을 일으켜 임한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받아나간다.
즉, 생사고통은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중생은 생사고통을 받아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중생에 대해 연민과 자비심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생사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중생을 안온한 니르바나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하고자 하는 원대한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수행자가 자비심에 바탕해 중생제도를 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는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 해 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행의 방향은 기본 수행과 다르게 된다.
즉, 회신멸지를 이뤄 3계 생사밖을 벗어남을 방향으로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중생이 생사고통을 겪는 욕계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함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 경우는 장수천인 색계나 무색계도 방편을 사용해 머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 수행자도 생사현실에서 생사의 고통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가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욕계 생사현실의 극한 고통에서도 평안히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의 욕계 극한 고통도 평안히 임할 수 있다고 하자. [안인의 성취]
그러면 3계내 생사현실 어떤 경우에서나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행자는 먼저 기초적으로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을 제거한다.
그래서 망집번뇌에 기초해 생사 생멸이 있다고 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상을 취하지 않고 임한다. [무상삼매해탈]
한편 깨달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자.
그러면 본 바탕 진여에는 생멸이란 본래 얻을 수 없다.
한편 생사현실내 생멸은 망상분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사정을 관한다.
그런데 생사현실은 본 바탕과 떨어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사가 곧 열반과 다르지 않다. [생사즉열반관]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본바탕 진여 측면을 취해 임한다.
한편, 본바탕에 비추어 볼 때 생사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또 한편, 실재와 생사현실 어느 것이나 참된 실체는 없음을 관한다.
한편 생사현실은 본 바탕 실재의 내용이 아님을 관한다.
또한 관념에는 감각현실과 같은 자상이 없음을 관한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같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이처럼 여러 방식으로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평안히 참고 임한다.
○ 무주처열반
수행자가 생사현실의 극심한 고통을 평안히 참는다.
그런데 수행자가 생사현실 안에서 오로지 평안히 니르바나 상태로만 임한다고 하자.
즉 현실에서 주어지는 대로 오로지 평안히 참고 머문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니르바나에 집착해 머무는 상태가 된다. [열반에 치우쳐 머무는 입장]
그러나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먼저 계를 구족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되도록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을 제도하려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바라밀다 수행을 통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해 무량행문을 닦아 나간다.
또한 생사현실 안에서는 어떤 선교방편만으로는 도저히 제도되지 않는 중생도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방편을 사용하여 항복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수행자 자신이 지옥에 처하게 되더라도 중생제도에서 물러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중생도 끝내 항복받아 함께 제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불국토를 장엄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행한다.
그리고 끝내 법신을 증득한다.
그래서 성불하는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수행자가 생사현실안에서 닦고 실천해야 할 수행이 무량하다.
그래서 이런 무량한 선법을 닦는 일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일체의 수행역시 집착 없이 임해야 한다.
생사현실을 깨달음을 바탕으로 관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들은 본래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다만 중생들이 망집에 빠져 있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중생을 생사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생사현실에 그처럼 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자가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무량한 수행공덕을 성취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본래는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수행자 이런 수행목표와 방안에 자신부터 망집을 일으킨다고 하자.
즉 그런 내용이 실답게 있다고 여기고 집착하며 수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수행부터 원만히 성취하기 힘들다.
또한 본래 올바른 깨달음의 입장에서 관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본래 생사현실에 중생이나 번뇌나 부처마저도 본래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에서는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임한다.
그리고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을 갖지 않고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와 성불을 위한 수행에 정진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수행 자체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다.
그리고 중생제도와 성불의 서원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생사현실 안에서 니르바나를 집착해 머물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에 정진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사현실에 집착해 머무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중생제도와 성불의 서원을 잘 성취한다.
이는 니르바나나 생사현실 어느 측면에도 머물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이를 무주처 열반이라고 칭한다. [무주처 열반]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서 각기 이런 입장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함께 차례대로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서 다음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
즉, 니르바나는 현실의 본바탕에 모두 본래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생멸이나 생사가 있다는 망집을 제거한다.
이 점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는 공통적인 수행목표가 된다.
한편,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제도를 행하며 무량한 선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런 바탕에서 이를 행한다.
즉,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을 떠나 임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해 이와 같이 임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경우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사정으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수행 방향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나가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멸을 멸하는 방안 - 회신멸지의 니르바나
망집에 바탕한 경우 생멸현상 일체가 결국 고통에 귀결된다. [일체개고]
이런 사정으로 생멸하는 현실일체를 고통으로 본다.
이런 경우 생멸현상을 모두 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애착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 묶임에서 해탈하고 니르바나 상태가 된다.
경전에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
색은 무너지는 법이다.
그 색이 소멸하면 열반이니,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수ㆍ상ㆍ행ㆍ식은 무너지는 법이다.
그것들이 소멸하면 열반이니,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니라.
...
(『잡아함경』 0051. 괴법경壞法經)
또한 경전에는 집착을 끊음과 해탈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 내용이 나온다.
...
색(色)의 경계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면...
수(受)ㆍ상(想)도 마찬가지이며, 행(行)의 경계에 대해 탐욕을 떠나면
탐욕을 떠난 뒤에는
행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접촉[觸]이 끊어지고,
행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맴이 끊어진 뒤에는
반연(마음이 대상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이 끊어진다.
반연이 끊어지고 나면 그 식(識)은 머무를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은 뒤에는 머무른다.
머무른 뒤에는 만족할 줄 안다.
만족할 줄 안 뒤에는 해탈한다.
해탈한 뒤에는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없다.
그리고 집착할 것도 없게 된다.
취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게 된 뒤에는
스스로 열반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
그리고 범행은 이미 섰다.
그리고, 할 일은 이미 마쳤다.
그리고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
(『잡아함경』 0039. 종자경種子經)
현실 일체를 모두 고통의 현상으로 본다고 하자
그러면 생멸과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는 니르바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본래 본바탕 실재에서는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근본 무명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망집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임한다.
그러면 한 주체가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 집착한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런 경우 이는 인과관계상 또 다른 생사고통을 이후 가져다준다.
때문에 그런 좋음은 세세생생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 징검다리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좋다고 보는 내용이 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좋다고 여겨진다.
그 좋음은 그것만 보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결국 멸해 없어진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무상하다.
생멸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사라진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가운데 얻게 되는 생멸현상 일체는 고통에 귀결된다.
그로 인해 세세생생 고통을 받게 된다.
일체 현실은 공한 실재, 진여를 바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망집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로 인해 현실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이들은 청정하고 공한 진여를 덮어 가리는 것이다.
생사현실은 어차피 무상하고 실답지 않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근본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내용을 얻는 근본바탕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면 망집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회신멸지의 남김이 없는 니르바나[무여열반] 상태에 이른다.
그러면 본래의 공한 진여 상태와 근본정신만 남는다.
그러면 이후 다시 망집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원칙적 방안이 된다.
본바탕 실재는 본래 생멸과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적멸 상태다.
따라서 공한 실재 진여는 생사고통을 떠난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리고 이를 생사현실의 생사고통에 상대하여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음처럼 생각하기 쉽다.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현실 내용이 생사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런 현실 내용은 현실에서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을 통해 얻는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에 독을 바른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오히려 쉽게 성취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현실 내용이 모두 고통이라고 하자.
그런데 생명이 죽게 된다.
그런 경우 그런 현실내용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
그래서 죽음을 생사고통의 해결방안이라고 잘못 여길 수도 있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다.
이런 경우 죽음이 탈출방안이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죽음 이후 그와 관련해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단멸관]
그런 단멸관이 옳다고 하자.
그런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 그렇게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사과정에서 생명이 죽는다.
그래도 그 생명의 근본정신(아뢰야식)은 소멸하지 않는다.
때문에 여전히 근본정신은 남는다.
그런데 근본정신이 근본무명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리고 망집번뇌를 일으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런 경우 각 주체 간에 가해피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로 인해 업장이 남아 있다.
그리고 망집번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이런 업과 망집번뇌에 바탕해 다음 생의 생명에 의탁한다.
그래서 사후 근본정신이 다른 생명에 얹힌다.
이후 근본정신(아뢰야식)이 매생 정신을 분화 생성시킨다. [3능변]
그리고 새로운 감관과 인식기관 및 정신(전5식과 제6의식 등)을 분화 발전시킨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5식과 제6의식이 분화 생성된다.
근본정신은 이런 정신을 변화시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근본정신은 생사과정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생사과정에서 5식과 제6의식이 소멸해도 마찬가지다.
또 그 내용물이 얻어지거나 얻어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해심밀경』 제3. 심의식상품心意識相品)
그런 바탕에서 다시 다음 생을 출발한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 또 다른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생사현실의 본바탕 실재 진여는 니르바나다.[원성실상, 진여]
그런데 이런 실재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정신 표면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현실>[의타기상]을 얻는다.
이는 감각기관을 통한 5식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갖는 관념[변계소집상]을 일으킨다.
이들은 제6식의 내용이다.
그런 가운데 그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세계로 여기고 대한다.
이처럼 다음 생에서 또 망집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해 나간다.
이러한 인연으로 각 주체 간에 가해와 피해관계가 된다.
그리도 이를 통해 다시 업장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그런 가운데 오는 세상의 <감각현실>[의타기상]을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생사윤회를 반복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장구한 세월동안 지속되어 간다.
따라서 단순히 생사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여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생사 묶임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을 통해 업장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 망집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근본 정신(아뢰야식)에서 이런 내용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정신이 다음 생에 또 다른 식(정신)을 변화시켜 나타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악행을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감옥에 붙잡혀 끌려가게 된다.
이 경우 감옥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
생사윤회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망집 번뇌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이 경우 그가 원하지 않아도 그 업장에 의해 3악도에 묶이게 된다.
즉, 지옥, 아귀, 축생 세계에 묶이게 된다.
한편 이런 업장은 이번 생에 한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전의 무한한 기간 동안 쌓아온 것이다.
따라서 생사윤회 고통은 단지 이번 한 생의 수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관과 인식기관을 독을 발라 기능을 정지시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생사과정에서 목숨을 마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윤회의 고통을 자연히 벗어나기 곤란하다.
그래서 수행을 행해야 한다.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각 주체는 자신, 자신의 생명, 목숨에 집착한다.
이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집착이 모든 집착은 근본이 된다.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을 통해 망상 분별과 번뇌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행하는 업을 중지한다.
그리고 올바른 수행에 정진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 발생할 생사고통을 예방하게 된다.
집착을 벗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당장 처한 고통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생사현실에서 집착한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이런 경우에도 고통과 두려움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무상한 생멸현상은 고통을 주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된다.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처음 망집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제7식이 일정부분을 취해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임한다.
그래서 한 생 동안은 그로 인한 감각 및 느낌 정서적 번뇌가 지속된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근본 망집까지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마음의 해탈(심해탈)과 지혜의 해탈(혜해탈)을 얻는다.
그리고 근본정신(아뢰야식)이 맑게 정화된다.
그리고 이후 번뇌와 애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후 생의 출발단계에 발생 분화된 몸과 마음이 없어진다. [회신멸지(灰身滅智)]
그런 경우 이후 망집에 바탕해 후생의 식(정신)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후 망집의 재료가 되는 감각과 인식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진여 실재를 덮을 현상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생명은 니르바나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청정한 근본정신과 진여 실재만 남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래 생멸현상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이후 세세생생 생사윤회를 벗어난다.
그래서 '남김이 없는 니르바나'[무여열반]이라고 표현한다.
♥Table of Contents
▣○ 회신멸지(灰身滅智) 니르바나의 문제점
♥Table of Contents
▣- 일반인의 입장에서의 문제점
불교에서는 망집에 바탕해 얻는 생사현실 일체를 모두 고통으로 본다.
공한 실재에서는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수행을 통해 본바탕 진여를 덮고 있는 모든 망집과 생사현실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런 청정한 근본정신과 공한 진여, 실재만 남긴다.
그런 경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망집에 바탕한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생멸하는 생사현실에 애착과 집착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추구하며 업을 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런 일반의 입장은 불교 수행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각 주체는 많은 것에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지위, 명예...등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를 좋은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를 얻어 유지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이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엔 소멸되어 없어진다.
그래도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매순간 여전히 이에 집착을 갖고 임한다.
특히 좋음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애착의 정도에 비례해 오히려 니르바나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 의문을 갖게 된다.
몸과 마음이 아주 없어진 회신멸지의 무여열반 상태라고 하자.
그런 상태는 적멸한 상태다.
그래서 생멸하는 현실을 얻을 수 없다.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고통과 함께 생멸현상 일체도 함께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즐거움이나 좋음도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런데 현실 안의 좋음에 애착을 갖는 입장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이런 상태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한다.
바위나 모래는 그 안에 정신이 없다.
망치로 부순다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각 생명은 고통을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바위나 모래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죽으면 아무 것도 없다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죽음 이후 고통이나 고통을 느낄 주체마저도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런 경우 살아서 애착을 갖던 것들도 역시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죽음에 두려움을 갖는다.
삶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고통을 피해 죽음을 곧바로 선택하지 못한다.
죽음보다는 삶이 좋다고 여긴다.
그래서 세간에서 개똥밭에서 구른다 해도 이승이 좋다고 말한다.
그처럼 삶에 집착을 갖고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지위, 명예...등에 여전히 애착을 갖고 임한다.
이런 집착이 세세생생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그래도 우선 당장 그런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상태로 임한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회신멸지 니르바나 상태를 두려워하게 된다.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이 모두 사라진 적멸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자 입장에서 회신멸지 상태의 문제점
수행자는 무한한 생사윤회의 고통을 문제로 본다.
그런데 회신멸지의 니르바나는 이런 생사윤회의 고통을 멸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수행의 원칙적 목표 상태로 삼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처럼 회신멸지 무여열반의 상태를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수행자가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리고 생사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다른 생명은 여전히 생사고통에 묶여 있다.
그래서 수행자가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른 생명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수행자는 중생 제도를 위해 오히려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 해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처럼 수행자가 생사고통의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는 먼저 <생사 즉 열반>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멸하는 현상이 곧 청정한 니르바나와 다르지 않음을 관한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안인을 성취한다.
그리고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그런 결과, 생사현실의 극한 고통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굳이 회신멸지(灰身滅智)의 니르바나에 들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임해서도 생사와 고통에 물들지 않고 머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서 복덕과 지혜를 원만히 성취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다라니 삼매 신통을 닦는다.
그리고 무량행문을 닦아 나간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제도해간다.
그리고 끝내 법신을 증득해 성불함을 목표로 수행을 해나간다.
이런 경우 회신멸지의 니르바나에 들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중생제도가 곤란해진다.
그래서 회신멸지 상태는 이런 경우 오히려 문제점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자비심을 갖고 중생제도를 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무한한 생사윤회의 고통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회신멸지의 니르바나에 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과 입장을 같이 해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생제도와 성불을 위한 수행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경우는 끝내 성불하지도 않고 열반에 들지 않으려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를 피하지 않는다.
경전에 다음 내용이 제시된다.
…….
"보살 일천제는 항상 열반에 들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능히 모든 법이 본래부터 열반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않는다.
…….
(『입능가경』 집일체불법품集一切佛法品)
K0160V10P0846c21L;
大慧菩薩白佛言:「世尊!此二種一闡提,
何等一闡提常不入涅槃?」 佛告大慧菩薩摩訶薩:
「一闡提常不入涅槃。
何以故?以能善知一切諸法本來涅槃,是故不入涅槃,
...
위와 같은 경전 내용이 이와 관련된다.
여기서 '일천제'란 본래 부처가 될 수 없는 이를 의미한다. [일천제一闡提, icchantika]
보살 수행자가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그 서원으로 인해 끝내 성불하지 않는 보살을 '보살일천제' 라고 칭한다. [대비천제大悲闡提]
이런 보살 일천제는 무한히 생사를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내 성불하지 않고 열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보살 수행자는 모든 생멸하는 현상이 본래부터 열반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생사현실이 본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곧 니르바나다.
이는 처음의 입장과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처음 현실 내용은 생멸하며 무상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처럼 무상한 생사현실은 고통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회신멸지 무여열반에 든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생사현실까지 제거됨을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생사현실에 본래 생멸과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그대로 본래 니르바나라고 제시한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관>과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
망상 분별과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경우 생멸하는 현상이 곧 청정한 니르바나임을 관하게 된다.
그런 경우 굳이 회신멸지(灰身滅智)의 니르바나에 들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생멸하는 현상에 관계없이 이에 물들지 않고 머물 수 있다.
생사현실에서 망상분별과 집착을 떠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곧 청정한 니르바나(열반)다.<생사 즉 열반>
이는 다음을 근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의 근거1
본래 본바탕 실재에서는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근본 무명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래서 망집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런 경우 이처럼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는 고통에 귀결된다.
그리고 생사에 묶인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을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 임해서도 번뇌와 고통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해탈지견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유여의열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생사현실 안에서 다음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생사나 생멸은 오직 망집 안에서만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그런 생사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론상 생사현실 즉 열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구생기 신견에 의해 생을 출발한 상태다.
이는 그가 현실의 삶에 임하는 이상 1생을 통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일정 상황에서 감각과 느낌을 여전히 받게 된다.
그런데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자.
그러나 망집을 제거해 그런 상황에서도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일으키게 되는 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인 수행을 통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평안히 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 일체는 그대로 곧 생사고통을 벗어난 니르바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인 <생사 즉 열반>의 상태를 현실에서 수행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득한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생멸하는 현상을 굳이 멸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의 근거2
한편 다음 근거에서도 생사 현실이 곧 니르바나라고 보게 된다.
우선 공한 실재에는 생멸이나 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 니르바나다.
그런데,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공한 실재와 차별적인 생멸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관계를 설명한다.
...
왜냐 하면 사리자여,
이 색은 색의 공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색의 공함은 색이 아니다.
그러나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은 색을 떠나지 않는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수, 상, 행, 식도 이와 같다.
...
라고 밝히고 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제 2분 행상품)
K0001V03P0916b13L;
何以故?舍利子!是色非色空,
是色空非色,色不離空,空不離色,色即是空,
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
乃至是十八佛不共法非十八佛不共法空,
是十八佛不共法空非十八佛不共法,十八佛不共法不離空,
空不離十八佛不共法,
十八佛不共法即是空,空即是十八佛不共法。舍利子!
如是菩薩摩訶薩修行般若波羅蜜多有方便善巧故,能證無上正等菩提。舍利子!
...
(大般若波羅蜜多經 卷 第四百八 第二分行相品第九之一)
즉, 현실에서 색ㆍ수ㆍ상ㆍ행ㆍ식 5온을 얻는다.
그러나 공한 실재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또한 현실은 그런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현실도 공한 실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色不'離'空)
또 공한 실재는 그런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공한 실재는 본래 어느 상태에나 갖추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처럼 관할 수 있다.
현실은 곧 공한 실재에 즉해 맞닿아 있다.
그리고 공한 실재는 곧 현실에 즉해 맞닿아 있다.
결국 현실은 이런 색즉시공과 같은 관계다.
따라서 현실에서 공한 실재의 측면을 취해 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을 곧 니르바나의 상태로 관할 수 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현실과 실재의 관계에 대해 다음처럼 제시한다.
먼저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의 현실 내용이 공한 실재와 다르지 않다. (色不'異'空)
그리고 현실 내용과 공한 실재는 서로 즉해 맞닿아 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구절]
또한 공한 실재에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중무색무수상행식(空中無色無受想行識)...이하]
(『반야바라밀다심경』 현장역)
K0020V05P1035a05L;
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
亦復如是。
「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
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
『반야바라밀다심경』은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 핵심내용을 뽑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 사용된 불이(不異) 즉(卽) 무(無)표현을 주의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실재의 공함은 -이다 -아니다 -이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등의 모든 2분법상의 분별을 떠난다.
따라서 불이(不異)는 '같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같고 다름 모두를 떠남>을 나타낸다.
한편, 즉(卽)은 이는 두 내용이 종이 앞뒷면처럼 즉해서 <맞붙어있음>을 나타낸다.
'A卽B'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A가 곧 B이다' (A=B)를 나타낸다고 오해하기 쉽다.
또는 'A와 B는 완전히 동일한 하나다'(A≡B)를 나타낸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렇게 즉(卽)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뒷부분 공중무색(空中無色) 이하부분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공은 본래 <-이다- 아니다를 모두 떠남>이다.
공과 색수상행식의 관계를 불이(不異)나 즉(卽)의 관계로 판단하는 사정이 있다.
이는 본바탕 실재와 현실이 서로 떠나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리不離]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그 사정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
왜냐 하면 사리자여,
이 색은 색의 공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색의 공함은 색이 아니다.
그러나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은 색을 떠나지 않는다.
...
(『대반야바라밀다경』 제 2분 행상품)
즉 공한 실재와 현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공한 실재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 아니다. [비非]
그리고 실재는 색ㆍ수ㆍ상ㆍ행ㆍ식과 다르다.
그래서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실재와 현실은 서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리不離]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불이不異]
그리고 서로 즉해 맞닿아 있다. [즉卽]
한편 공중무색(空中無色) 이하에서 무(無)란 표현은 <-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내용을 얻을 수 없어 <있고 없음을 모두 떠남>을 나타낸다.
이를 자칫 잘못하면 유무 2분법상의 무의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참고: 격의불교]
그러나 공은 유무 양변을 모두 떠난다.
따라서 여기서 무(無)는 2분법상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무(無)는 단지 다음 사정으로 인해 방편상 사용하게 되는 표현이다.
우선 상대가 아직 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직 유무 2분법상의 분별을 하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공의 의미를 이해시켜야 한다.
한편 상대는 특히 있음에 치우쳐 집착하는 상태다.
그래서 실재에 무언가 실답게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우선 이런 망집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상대에게 공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일단 방편상 '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현실내용을 공한 실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자.
그러면 본바탕 실재의 측면에서는 그런 현상의 모든 차별적인 내용을 세울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본바탕 진여 실재에서는 생사고통이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진여 실재는 생사현실과 관계없이 본래 생사고통을 떠난 청정한 니르바나 상태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공한 실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가 그런 사정을 이해하든 않든, 본래 실재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생사현실에서는 망집에 바탕해 그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진여 실재의 사정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실재가 공함을 깨닫는 의미가 크다.
이런 입장에서 생멸하는 현상을 곧 공한 진여의 다른 면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생멸하는 현상을 곧 니르바나의 다른 면으로 관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이런 입장에서 공한 실재의 측면을 취한다.
즉, 생멸하는 현상에 관계없이 청정한 니르바나의 측면을 취한다.
그런 상태로 현실을 대한다.
그래서 현실을 실재의 공함에 상응한 상태로 관한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생을 출발하기 전에 일으킨 구생기 신견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한 생 동안은 이에 바탕해 생에 임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여전히 고통의 감각이나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서적 의지적 반응을 취하게 되기 쉽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공한 실재의 측면을 99% 취한다.
그리고 현실을 대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노력을 통해 극심한 생사고통을 평안히 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안인을 성취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 임해서도 여여하게 열반의 상태로 임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인 <생사 즉 열반>관을 현실에서 실증적으로 증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생멸을 떠나 불생불멸인 진여법성을 현실에서 인지(忍知)한 상태도 의미한다.
그리고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해서도 그대로 평안히 머물 수 있다. [무생법인無生法忍, anutpattika-dharma-kṣānti]
안락한 현실에서는 이런 이론과 일반적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다.
이들 내용과 일반적 입장이 차이가 나는 측면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무생무멸의 이론을 이해하고 인가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극심한 생사고통을 평안히 참고 임할 수 있는 안인 수행노력이 요구된다.[忍 kṣānti]
즉 이론과 현실이 일치된 상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자.
그러면 거꾸로 니르바나 즉 생사고통의 상태가 된다.
즉 본래 니르바나인 상태를 대해 생사고통을 겪어나가는 상태가 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의 근거3
본바탕 실재는 공하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 실재가 공함을 관한다.
그러면 이를 통해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도 관할 수 있다.
즉, 실재는 공하여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매순간 생생하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은 마치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꿈을 실답지 않다고 여긴다.
이는 꿈이 갖는 특성 때문이다.
꿈은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만 임시적으로 얻는 내용일 뿐이다. [임시성]
즉 그런 조건과 상황을 떠나면 얻을 수 없다. [조건의존성]
한편, 꿈 내용은 정작 꿈을 꾼 침대에서는 얻을 수 없다.
즉 꿈 내용을 얻는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다.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득]
한편 평소 일정한 내용은 일정한 여러 성품을 갖는다고 여긴다.
그런데 꿈 내용은 그런 성품을 갖지 못한다.
즉 그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성품들을 얻지 못한다. [가짜성품]
그런데 현실 각 내용도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현실 내용도 꿈과 마찬가지로 실답지 않다.
(참고 ▣- 실답지 않음의 판단 )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다.
그럼에도 대부분 현실을 실답게 여긴다.
그래서 현실을 실답게 잘못 여기게 되는 배경사정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 생사현실을 참된 진짜이고, 실답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정)
또 그런 가운데 현실을 실답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깨뜨리는 논의도 필요하다.
(참고 ▣- 수학문제에서 답의 '유무' 논의)
이들 내용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살폈다.
따라서 이러 여러 논의를 통해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갖는 생멸, 고통 등의 여러 관념도 실답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론상 생사현실이 곧 열반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현실에서 집착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한 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근본 망상 분별을 제거하고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실재에 상응한 상태로 올바로 현실을 관한다.
그리고 극심한 생사고통에서도 현실을 꿈처럼 관하여 임한다.
그런 가운데 극심한 생사고통에서 평안히 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안인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런 상태는 이론적인 생사현실 즉 열반을 현실에서 실증적으로 증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사윤회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지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경전에서는 5무간지옥이 보리라고 제시한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제 574 권 만수실리본)
수행을 한다.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진실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해탈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생사현실에서 여여하게 열반의 상태로 임하게 된다.
그러면 생사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의 근거4
한편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말하기도 한다.
한 주체가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감각현실>을 먼저 얻는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진짜라고 볼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본바탕에도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실체의 내용이 없다. [승의무자성]
그리고 이들 현실 내용에도 그런 실체는 없다. [무아, 인무아, 법무아, 무자성]
한편 본바탕인 실재의 내용은 끝내 얻지 못하여 공하다.
그런데 그런 현실내용은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도 아니다.
현실 내용은 여러 조건에 의존해 한 주체가 얻는 내용이다.
즉 자체적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의타기상의 생무자성]
한편 이런 <감각현실>에 바탕해 다시 관념적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런 분별내용에는 <감각현실>과 같은 자상이 없다.[ 변계소집상의 상무자성]
또 반대로 <감각현실>에는 그런 관념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 생멸이나 생사, 고통을 있다고 분별한다.
그런데 이런 생멸이나 고통은 단지 망상 분별 안에서만 있는 내용일 뿐이다.
즉, 관념영역에서 일으킨 망집에 바탕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진짜처럼 여겨지는 것뿐이다 .
따라서 이런 망상분별을 떠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생멸과 고통은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실답지 않은 내용일 뿐이다.
그래서 현실 자체가 곧 니르바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심밀경』에서는 본래 일체법이 다 열반임을 제시한다.
...
일체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다.
그래서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법의 자상(自相)이 도무지 있는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곧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요,
생기는 것이 있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곧 멸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곧 본래 고요할 것이요,
본래 고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곧 자성이 열반이다.
그 가운데는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아예 조금도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상무자성성의 밀의에 의지해,
일체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
K0154V10P0717c05L;
說言一切諸法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何以故。
若法自相都無所有則無有生。
若無有生則無有滅。若無生無滅則本來寂靜。
若本來寂靜則自性涅槃。
於中都無少分所有更可令其般涅槃故。是故我依相無自性性密意。
說言一切諸法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
...
(『해심밀경』 무자성상품無自性相品)
생멸이나 고통은 본래 참된 실체가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진짜라고 할 실체도 아니다.
한편 이는 실재의 내용도 아니다.
실재의 영역에서 이들 내용을 모두 얻을 수 없다.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또한 <감각현실>도 그런 관념이 아니다.
그리고 관념에 그런 <감각현실>(자상)이 없다.
그리고 <감각현실> 영역에서도 그런 관념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망집에 바탕한 분별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관념은 실답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생멸 생사는 모두 실답게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생사현실에서 본래 실다운 생멸과 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곧 이를 니르바나라 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열반 즉 생사>와 <생사 즉 열반>의 관계
<생사 즉 열반>이다.
그러나 이는 그것만으로 생사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본래 그 안에서 고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수행을 통해 해결할 문제도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생사현실에서 각 주체가 생사고통을 겪는다.
생사현실의 본바탕 실재는 본래 니르바나다.
그럼에도 결국 뭇 생명은,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따라서 생사고통의 해결이 문제된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이를 해결해가야 한다.
이는 다음 사정 때문이다.
우선 한 주체가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망상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낸 내용의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그에 집착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에 처한다.
이런 경우 생사 즉 니르바나의 반대 상태가 된다.
즉 본래 니르바나인 상태를 대해 생사고통을 겪는 상태가 된다. [열반 즉 생사]
이는 <생사 즉 열반관>의 내용과 반대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사정을 다음처럼 반대로 나열할 수 있다.
우선 한 주체가 망집에 바탕해 임해 생사현실을 얻는다.
그런 경우 망집으로 인해 본래 니르바나인데도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열반 즉 생사1]
한편, 그는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 실재가 공함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현실 안에서 공한 실재의 측면을 취해 현실을 대하지 못한다. [열반 즉 생사2]
한편, 실재가 공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이런 본바탕에 비추어 꿈처럼 실답지 않음도 관하지 못한다. [열반 즉 생사3]
한편,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음[승의무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감각현실>이 객관적 실재가 아님[생무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관념은 구체적 개별상[자상]이 없는 것[상무자성]이어서 실답지 않다는 사정도 깨닫지 못한다.[열반 즉 생사4]
본래 생사현실이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는 니르바나의 상태이다. [<생사 즉 열반>]
그런데도 이런 사정으로 본래 니르바나인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이런 경우는 본래의 니르바나의 상태가 망상분별에 덮인 상태다.
그러나 이는 망집을 바탕으로 한 경우다.
이런 경우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우선 망집에 바탕한 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근본 원인이 되는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깨달음의 입장에서 현실을 관한다.
그런 경우 다음을 이해하게 된다.
생사나 생멸은 오직 망집 안에서만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그런 생사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생사 즉 열반>1]
한편 본바탕 실재에서는 본래 그런 생멸이나 생사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 본바탕은 생사 고통을 얻을 수 없는 열반의 상태임을 관한다.
그래서 본바탕의 측면을 취해 현실을 대한다.
즉, 생멸하는 생사현실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의 상태로 임한다. [<생사 즉 열반>2]
또 생사현실이 본바탕 실재에 비추어 볼 때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래서 꿈에서 꿈이 꿈인 것을 알고 임하듯 현실에 임한다. [<생사 즉 열반>3]
한편 생사현실은 참된 실체가 없다.
그리고 각 내용이 실답게 볼 특성이 없음을 관한다.
그래서 현실의 생사고통이 실다운 생사고통이 아님을 잘 관하고 임한다. [<생사 즉 열반>4]
그리고 이런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극심한 생사고통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임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경우 이론적인 <생사 즉 열반>의 상태를 실증적으로 증득한 상태가 된다.
그런 경우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벗어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의 상태로 임한다
그래서 근본 망집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은 본래 생사 고통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열반도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래서 번뇌와 집착을 소멸한 상태에 그 비중을 두게 된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색은 본래부터 그 일체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이렇게 알고 나면
그 색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번뇌의 해로움과 불꽃,
근심과 번민은 모두 끊어져 없어진다.
그것이 끊어져 없어진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된다.
집착할 것이 없게 된 뒤에는 안락하게 머무르게 된다.
안락하게 머무른 뒤에는 반열반(般涅槃)을 얻게 된다.
수ㆍ상ㆍ행ㆍ식도 그와 같으니라."
(『잡아함경』 0035. 삼정사경三正士經)
..
염부차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열반(涅槃)이라고 합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열반이라는 것은
탐욕이 영원히 다하고,
성냄이 영원히 다하며,
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하고,
일체 모든 유루(有漏 : 번뇌)가 영원히 다한 것이니,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 『잡아함경』 0490. 염부차경閻浮車經)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에 생멸을 본래 얻을 수 없음
♥Table of Contents
▣- 3가지 존재영역 - 원성실상ㆍ의타기상ㆍ변계소집상
- [생사현실에 생멸을 본래 얻을 수 없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의 상태로 임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무엇보다 망집의 제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사정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사나 생멸은 오직 망집 안에서만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그런 생사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망집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생사현실 일체에서 본래 생멸 생사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먼저 각 존재 영역을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존재의 유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본바탕실재 - <감각현실> - 관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들 각 영역의 내용과 관계를 살핀다.
이는 실상(實相 dharmatā ; dharma-svabhāva) - 상(相 Lakṣaṇa) - 상(想 Saṃjña)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 달리 원성실상-의타기상-변계소집상이라고 표현한다.
♥Table of Contents
▣- 원성실상과 승의무자성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일정한 주체가 관계되어 그 주체가 얻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그 주체의 마음에 얻게 되는 마음내용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주체가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일체 없다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감는다.
그러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직전에 본 모습은 일체 사라져 세상에 없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주체와 관계없이 무언가가 그대로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그래서 본바탕 실재를 추리하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떤 주체와 관계없이 그대로 있다고 할 본바탕을 '실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래 있는 그대로(진여)로서의 내용이다. [실상, 진여, 실재]
본바탕 실재는 현실내용의 바탕이다.
그런 경우 본바탕 실재는 아무 것도 전혀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주체는 끝내 그 내용을 직접 얻을 수 없다.
한 주체는 오직 그가 관계해 화합해 얻는 내용만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2분법상의 분별을 행할 도리가 없다.
즉, -이 있다, -이 없다, -이다, -아니다, 같다, 다르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생한다, 멸한다 ... 등으로 분별할 수 없다.
그리고 언설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를 의미를 갖지 않는 '공'이란 표현을 빌려 공하다고 표현한다.
이런 공한 실재가 현실의 본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런 실재에서는 현실에서 문제 삼는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생사고통의 현실에 상대되는 원만히 성취된 진여 실재 니르바나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원성실상이라고 표현한다. [원성실상圓成實相, pariniṣpanna-lakṣaṇa]
경전에 원성실상에 대해 다음처럼 제시한다.
...
무엇이 모든 법의 원성실상인가?
이른바 일체 법의 평등한 진여이다.
...
(『해심밀경』 4. 일체법상품一切法相品)
그러나 이런 실재에도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승의무자성勝義無自性, 승의무성勝義無性]
♥Table of Contents
▣- 의타기상과 생무자성
한편, 실재를 바탕으로 한 가운데, 각 주체는 현실에서 여러 조건과 화합하여 <감각현실>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눈을 뜨면 일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감관이 관계하여 각 종류의 <감각현실>을 얻게 된다.[색성향미촉]
이들은 실재를 바탕으로 한 가운데 각 주체가 각 조건에 의존해 화합해 얻는 내용이다. [의타기상]
경전에 의타기상에 대해 다음처럼 제시한다.
...
무엇이 모든 법의 의타기상인가?
이른바 일체 법의 인연으로 생기는 자성이니,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무명(無明)은 행(行)의 연이 되고, 나아가 순전히 큰 괴로움의 덩어리를 부르고 모은다.
(『해심밀경』 4. 일체법상품一切法相品)
의타기상은 이처럼 각 조건에 의존해 화합해 얻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본바탕 실재의 내용 그대로가 아니다.
즉 한 주체와 관계없이 본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생무자성生無自性, 생무성生無性, utpatti-niḥsvabhāvatā]
그런 만큼 실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정한 조건이 되면 꾸게 되는 꿈과 성격이 같다.
♥Table of Contents
▣- 변계소집상과 상무자성
한편 각 주체는 다시 관념을 일으켜 얻는다.
예를 들어 한 주체가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그 일정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관념영역에서 각 부분을 이리저리 묶고 나눈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관념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언설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들이다.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 parikalpita-lakṣaṇa]
경전에 변계소집상에 대해 다음처럼 제시한다.
...
무엇이 모든 법의 변계소집상인가?
이른바 이름으로 거짓되게 세워진 일체 법의 자성과 차별이고,
나아가 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
(『해심밀경』 4. 일체법상품一切法相品)
그런데 그런 관념 안에는 <감각현실>과 같은 자체의 모습[자상]이 없다. [상무자성相無自性, 상무성相無性, lakṣaṇa-niḥsvabhāvatā]
그 만큼 관념은 실답다고 할 수 없다.
♥Table of Contents
▣- 유무극단을 떠난 3성 3무성의 관계
존재가 문제되는 영역을 원성실상-의타기상-변계소집상으로 나누어 살핀다.
이를 원성실성, 의타기성, 변계소집성이라고도 표현한다.[3성三性]
이는 본바탕실재 - <감각현실> - 관념 각 영역의 내용에 해당한다.
또 이는 실상(實相 dharmatā ; dharma-svabhāva) - 상(相 Lakṣaṇa) - 상(想 Saṃjña)의 관계다.
그런데 이들 각 영역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한편 이들 각 내용은 마치 꿈처럼 실답지 않다.
즉 각 영역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실답게 볼 수 있는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승의무자성, 생무자성, 상무자성의 내용으로 제시하게 된다. [3무성三無性]
이 3성과 3무성은 곧 유무 양변의 극단을 떠남을 나타낸다.
먼저 3성으로 원성실성ㆍ의타기성ㆍ변계소집성을 제시한다.
이는 각 영역에서 각 내용이 '실답지 않은 형태로 있음' 즉 '유'의 측면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는 무의 극단을 떠남을 나타낸다.
여기서 무의 극단은 어떤 내용이 전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3무성으로 승의무자성ㆍ생무자성ㆍ상무자성을 제시한다.
이는 각 영역에서 각 내용이 '실답게 있는 것은 아님' 즉 '무'의 측면의 나타낸다.
그래서 이는 유의 극단을 떠남을 나타낸다.
유의 극단은 어떤 내용이 참된 실체로서 실답게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각 내용은 서로 간에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즉 각 내용은 마치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각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답지 않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3무성과 생사현실의 실답지 않음
존재가 문제되는 각 영역의 특성을 3성과 3무성으로 살핀다.
그래서 이들이 각기 그 영역과 성격이 서로 다름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 내용이 실다운 내용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각 영역에 각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실답지 않게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승의무자성ㆍ생무자성ㆍ상무자성의 내용으로 제시한다. [3무성三無性]
우선 이들은 꿈과 다른,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본체가 아니다.
꿈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얻는다.
그래서 변화한다.
그리고 침대가 놓인 현실에서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 기대하는 성품도 얻을 수 없다.
꿈속의 바닷물은 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는 참된 진짜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이런 꿈과 다른 성격을 갖는 내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를 참된 진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관념으로 먼저 그려낸다.
그리고 이를 참된 실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실체를 찾아 나선다.
그래서 그런 참된 진짜로서 실체가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그런 경우 진여실재의 영역에서도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 [승의무자성勝義無自性]
본래 진여실재 영역에 대해서는 유무 등 2분법상의 모든 분별 판단을 떠난다.
따라서 진여 실재 영역은 언설을 떠난 승의제의 영역이다. [승의제勝義諦 paramārtha-satya]
그러나 실체의 유무는 이와 별개로 실체의 관념적 판단을 통해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영역에 걸쳐 실체는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만일 실재영역에 실체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실재가 무엇인가 문제될 때 실재를 공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
공하다는 내용 대신 실체에 해당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는 실체란 관념이 관념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체는 실재영역에도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실재의 공함은 참된 실체가 없는 가운데, 한 주체가 그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실재는 결국 무아ㆍ무자성이고, 공하다.
결국 실재 영역에도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
따라서 결국 본바탕 실재 역시 꿈처럼 실답지 않다.
다만 이는 여러 현실 내용의 본바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를 '실'상 또는 '실'재라고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이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즉 실상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진짜로서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는 공이 참된 진짜 실체로서의 성품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실체의 유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부분 이하를 참조하기로 한다.
(참고 ▣- 실체의 유무 문제 )
그리고 이런 사정은 <감각현실>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관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들 각 영역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는 모두 없다.
이런 사정을 무아, 무자성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한편, <감각현실>은 본바탕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즉 한 주체와 관계없이 본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생무자성生無自性]
이는 일정 상황에서 조건에 의존해 일시적으로 얻는 꿈과 그 성격이 같다.
따라서 <감각현실>은 그 만큼 실다운 것이 아니다.
한편 관념 안에는 <감각현실>과 같은 구체적 개별 모습[자상]이 없다.
경전에서 '변계소집상에는 자상이 없다'고 제시한다. [상무자성相無自性]
이는 다음을 나타낸다.
우선 여기서, 자상(自相)은 공상(共相)에 상대되는 말이다.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일정 부분을 취해 영희나 철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희가 100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온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가락보다 작게 보인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의 자신 만하게 크게 보인다.
그래서 영희가 달려오는 매 순간 그 크기나 모습 형태가 달라진다.
이 각 모습을 α,β,γ,δ,ε,ζ,η,ι,κ,λ,μ,ν,ξ 로 표시한다고 하자.
이처럼 매 순간마다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매 순간 제각각 다른 구체적 모습이 있다.
그런데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런 <감각현실> 각 내용을 모두 하나의 영희라고 잘못 여긴다.
즉, 이런 각 구체적 모습을 모두 영희라는 관념에 공통적으로 대응시킨다.
이 경우 분별관념은 이들 각 모습에 공통한 내용으로 여긴다. [공상共相]
그래서 그가 일으킨 관념 영희는 공상(共相-공통된 모습)이 된다.
한편 이 경우 각 순간에 얻는 <감각현실>은 구체적 개별상이다.
그리고 이를 공상에 상대해 자상이라고 칭한다. [자상自相]
즉, 자상은 감각을 통해 매 순간 <감각현실>로 얻는 구체적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눈을 떠 대하게 되는 낱낱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공상과 자상의 관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념은 사실상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관념에 그런 <감각현실>은 들어 있지 않다.
즉, 관념에 개별적인 구체적 모습[자상]은 들어 있지 않다. [상무자성]
그리고 이런 사정을 상무자성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관념은 그 만큼 실다운 것이 아니다.
단 한 단면 하나의 <감각현실>[자상]에서 단 하나의 관념만 일으킨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관념에는 <감각현실>과 같은 자상이 들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대해 일정한 관념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 관념은 먼저 <감각현실>의 부분을 나누거나 묶어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관념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이 바위라고 분별해 생각을 일으킨다.
이 때 이런 생각은 자신이 눈을 뜨지 않더라도 여전히 떠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관념이다.
그래서 <감각현실>과는 구분된다.
한편 관념은 이후 말이나 생각만으로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관념만 떠올린다.
그리고 그 관념에 <감각현실>이 있는지 찾아본다.
즉 직전에 눈을 떠 보았던 그 모습이 들어 있는지 찾아본다.
그런 경우 관념 안에서 그런 <감각현실>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경전에서 '변계소집상에는 자상이 없다'고 제시한다. [상무자성相無自性]
그런데 이것이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음 안에서 자신이나 세상, 있음, 없음, 생겨남, 멸함, 오고감...등 여러 관념을 생각한다.
마음에서 그런 각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 경우 관념 영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
즉,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관념에 그에 해당한 구체적 개별상은 찾아낼 수 없다.
즉 관념에 <감각현실>은 들어 있지 않다.
그 만큼 그 관념을 실답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관념으로 일으킨 집착을 제거함에 중요하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내용을 놓고 판단한다고 하자.
이들은 하나같이 참된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실다운 내용으로 인정할 만한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승의무자성, 생무자성, 상무자성이라고 표현한다. [3무성]
♥Table of Contents
▣- 3무성과 <생사 즉 열반>
생사현실에 본래 생멸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제시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주체는 <감각현실>을 비롯한 현실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들은 생겨나고 멸함을 반복한다고 여기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다.
일체법은 본래 모두 진짜라고 할 영원불변한 실체의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생함이나 멸함은 본래 참된 진짜의 내용으로서는 없다. [승의무자성]
즉 어떤 내용이 있어도 이는 참된 진짜가 아니다.
꿈처럼 실답지 않은 가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전에서 이런 승의무자성에 의지해 자성이 열반이라고 제시한다.
(『해심밀경』 5. 무자성상품無自性相品)
한편 한 주체가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예를 들어 한 주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감각현실>은 본바탕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즉 한 주체와 관계없이 본래 그대로 있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생무자성生無自性]
이는 일정 상황에서 조건에 의존해 일시적으로 얻는 내용이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그 성격이 같다.
따라서 <감각현실>은 그 만큼 실다운 것이 아니다.
한편, 현실에서 <감각현실>을 대해 다시 분별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런 경우 일정한 <감각현실>[색]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취해 '자신'이라고 여긴다.
또 나머지 부분은 외부세상으로 여긴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이거나 '꽃'이라고 여긴다.[다른 생명, 유정]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산'이나 '바위'로 여긴다.[무정물]
그리고 이들 각 내용이 생멸한다고 여긴다.
이 경우 생멸이란 관념이 마음 안에 나타나 머무른다.
그리고 그 관념은 일정한 <감각현실>을 가리킨다.
그런 경우 그러그러한 <감각현실>이 감각영역에 들고 남을 생멸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그가 생각하는 '생멸'이란 것은 그 자체가 관념 영역에서 갖는 관념(변계소집상)이다.
즉, 이처럼 일으킨 생각은 관념내용이다.
그러나 그런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또한 <감각현실>도 관념이 아니다.
이들 관념은 눈을 뜨거나 눈을 뜨지 않거나 관계없이, 떠올릴 수 있다.
반대로 감각내용은 눈을 떠야만 그 순간에만 그런 내용을 얻게 된다.
그래서 관념과 <감각현실>은 서로 구별된다.
한편 그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념을 그런 <감각현실>을 떠나 얻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감각현실>을 대할 경우는 또 그런 관념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 주체는 이런 내용을 함께 얻는다.
즉 이런 경우 관념이 가리키는 <감각현실>을 그 배경으로 동시에 생생하게 얻는다.
그리고 이 경우 그런 분별은 분별영역에서 명료하게 일으킨다.
현실에서 관념은 그처럼 마음 안에 나타나 머무른다.
그런 사정으로 이 두 내용을 서로 결합시켜 대하게 된다.
즉, <감각현실>에서 관념을 일으켜 갖는다.
그런 가운데 그 관념을 <감각현실>에 접착시켜 붙여 이해한다.
그래서 <감각현실>에 그와 같은 관념내용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또 반대로 관념내용은 그런 <감각현실>을 구성요소로 갖고 있다고 잘못 여긴다.
이처럼 각 주체가 관념의 영역에서 망상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즉, 각 존재의 본래의 상태에 상응하지 않은 분별을 행한다.
그래서 각 내용이 다른 영역에서도 얻어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이들 내용이 이들 각 영역에 실답게 있다고 여긴다.
그런 경우 그런 생멸도 현실에 실답게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이를 꿈과 달리 실다운 내용인 것으로 잘못 여기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실 사정이 그렇지 않다.
이들은 단지 마음 영역에서 일으킨 분별이다.
있는 것은 단지 분별이나 명칭뿐이다.
물론 이 상황에 그러그러한 <감각현실>을 생생하게 얻는다.
그리고 관념영역에서는 명료하게 분별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제각각 일으킨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 경우 그 관념이 가리키는 <감각현실> 부분을 살펴본다.
그런데 그 <감각현실> 영역에 그런 관념내용은 얻을 수 없다.
한편 관념 영역에서 <감각현실>을 찾아본다.
그런 경우 관념 영역에서도 그런 <감각현실>은 없다.
즉 관념은 <감각현실> 내용과 같은 자상(구체적 모습)을 갖지 않는다.[상무자성]
그래서 관념내용은 곧 그런 <감각현실>도 아니다.
또 <감각현실>도 그런 관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먹물을 마구 흩뿌려 놓은 그림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어떤 이가 그 먹물을 대해 사람처럼 여긴다고 하자.
그러면 그 먹물 그림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먹물 그림에 그가 생각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
생사현실에서 일으키는 망상분별은 모두 이와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생멸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참된 진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체법은 본래 생멸을 떠난 것이다.
참된 진짜로서의 생사고통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생사현실은 곧 니르바나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앞에서 설한 내용이 제시되게 된다.
『해심밀경』에는 다음 구절이 나온다.
...
승의생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상무자성성(相無自性性)의 밀의에 의지해,
일체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법의 자상(自相)이 도무지 있는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곧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다.
생기는 것이 있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곧 멸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곧 본래 고요할 것이다.
본래 고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곧 자성이 열반이다.
그 가운데는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아예 조금도 없는 까닭이다.
....
선남자여,
나는 또한 법무아(法無我)의 성품으로 나타난 것인 '승의무자성성'의 밀의에 의지해,
일체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법무아의 성품에 의지해 나타난 승의무자성성은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법의 법성(法性)에 머무는 무위(無爲)이니,
일체 잡염(雜染)과 어울리지 않는 까닭에,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법의 법성에 머무는 까닭에 무위이다.
무위인 까닭에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그리고 일체 잡염과 어울리지 않는 까닭에 본래 고요하다.
그리고 자성이 열반이다.
...
(『해심밀경』 5. 무자성상품無自性相品)
K0154V10P0717c04L;
勝義生當知。我依相無自性性密意。
說言一切諸法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何以故。
若法自相都無所有則無有生。
若無有生則無有滅。若無生無滅則本來寂靜。
若本來寂靜則自性涅槃。
於中都無少分所有更可令其般涅槃故。是故我依相無自性性密意。
說言一切諸法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
...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과 수행의 필요성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다.
그래서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생사현실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수행도 필요 없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본바탕 실재와 생사현실에는 본래 생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생사현실에 본래부터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다.
그러나 망집을 일으켜 이를 대한다.
그러면 각 주체는 실재를 바탕으로 <감각현실>을 인연 화합으로 얻는다. [의타기상]
그런 가운데 이를 배경으로 놓고 여러 관념을 일으켜 갖는다.
그런 가운데 온갖 분별을 행하게 된다. [변계소집상]
그리고 이런 망상 분별을 바탕으로 번뇌와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무언가 좋음을 추구해 나간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해 나가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후 생사고통을 극심하게 겪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현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망식을 일으키는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생사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상속되어 이어진다.
이런 바탕에서 무량겁에 걸쳐 생사고통을 받아 나가게 된다.
『해심밀경』에서는 현실의 생사고통의 윤회과정이 나타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
이처럼 의타기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 위에서 변계소집의 자성을 집착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오는 세상의 의타기의 자성을 일으킨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
번뇌잡염(煩惱雜染)에 물들며,
혹은 업잡염(業雜染)에 물들며,
혹은 생잡염(生雜染)에 물들어
나고 죽는 가운데서 오래도록 헤매고
오래도록 굴러다니며 쉴 사이가 없고,
혹은 지옥[나락가那落迦]나 축생[傍生]이나 아귀(餓鬼)나
하늘이나 아수라[阿素洛]나 혹은 사람 가운데 태어나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
K0154V10P0718a13L;
如是於依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上。
執著遍計所執自性。由是因緣。生當來世依他起自性。
由此因緣。或為煩惱雜染所染。
或為業雜染所染。或為生雜染所染。
於生死中長時馳騁。長時流轉無有休息。或在那落迦。
或在傍生。或在餓鬼。或在天上。
或在阿素洛。或在人中受諸苦惱。
...
참조 『해심밀경』 5. 무자성상품(無自性相品) K0154 T0676
근본불교에서는 이를
혹-업-고[惑-業-苦; 번뇌ㆍ집착-행위(업)-고통]의 관계로 제시한다.
이는 고통의 생사윤회가 나타나는 인과 관계다.
즉, 처음 근본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생멸한다고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멸과 생사고통이 실답게 존재한다고 여기게 된다.
그 바탕에서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고통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그런 결과 망집에 바탕해 얻는 일체 생사현실은 모두 고통과 관련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이런 생사고통의 해결이 문제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그래서 원인이 되는 망집과 업을 제거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의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의 정체를 위와 같이 올바로 관한다.
그런 경우 이들 내용이 각 영역에서 서로 일정한 관련성은 있다.
그러나 본래 떨어진 별개의 내용이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그런 생사고통 자체가 본래 실답게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망상 분별을 제거한다.
그러면 곧 일체는 열반적정이라고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일체는 본래 생멸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현실이 곧 생멸이 없는 니르바나임을 이해하고 관한다.
그런 경우에 그 생사현실은 본래 그런 문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래 해결된 상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실의 내용에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통해 생사현실의 고통에서 평안하게 임한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본래의 니르바나의 상태를 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계로 수행을 통해 니르바나를 얻는다고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니르바나 자체는 수행을 통해 비로소 새로 얻는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이미 갖추어진 내용이다.
다만 망상에 덮여서 그 사정을 그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 임한 것뿐이다.
[이계과(離繫果), 택멸무위(擇滅無爲)]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측면을 다 함께 제시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서로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해결해야 할 생사고통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수행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사고통은 본래 없는가
그래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수행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그 각 내용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한다.
하나는 망집에 바탕해 일반적으로 여기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그런 망집을 제거한 가운데 올바른 깨달음으로 관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사정이 있다.
생사현실에서 각 주체가 망집을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생사고통 문제가 현실에 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생사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하고 없애야 한다.
그래서 생멸현상을 깨달음을 통해 관해야 한다.
그래서 그 생사현실을 깨달음의 입장으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자체에 본래 생멸과 고통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내용은 설산동자의 게송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설산동자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다.
이는 나타나고 멸하는 현상이다.
나타나고 멸함이 없어지고 나면,
적멸이 즐거움이 된다.
...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
♥Table of Contents
▣- 관념이 실답지 않은 사정 - 환자와 가족의 비유를 통한 이해
한 주체는 현실에서 수많은 관념분별을 행한다.
그런데 관념으로 가진 분별내용이 실답지 않다.
즉, 관념은 그 안에 구체적 개별상인 자상이 없다.
또 관념은 <감각현실> 영역에서도 얻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본바탕인 실재 영역에서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침대에서 누어 꾼 바다처럼 실답지 않다.
또한 관념은 참된 진짜로서 실체도 아니다.
따라서 실다운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상식의 바탕에서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이해하여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시 비유를 통해 이 사정을 이해해보기로 한다.
그래서 의식을 상실한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어느 환자가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지낸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어 눈만 깜박거린다.
환자가족들은 이를 보고 슬퍼하고 걱정한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
또 치료비 마련을 위해 분주히 활동한다.
이런 비유는 <감각현실>의 관념적 내용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의타기상(<감각현실>)과 변계소집상(관념적내용)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나선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살핀다.
그래서 실재(진여, 원성실상)-<감각현실>(의타기상)-관념(변계소집상)의 영역을 살핀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고통을 살핀다.
이 경우 가족들은 환자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이다.
환자 가족에게는 환자가 직접 느끼는 <감각현실>이 없다.
단지 환자를 지켜보면 일으키는 관념분별만 있다. [변계소집상의 상무자성]
의사는 다시 환자 상태를 살핀다.
그런데 그 환자는 의식이 없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작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 내용이 없다.
한편 <감각현실>만 놓고 살펴보자.
<감각현실>은 인연화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는 실재의 내용도 아니다. [의타기상의 생무자성]
역시 침대에서 꾼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이 역시 실답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
한편 본바탕 실재는 어떤 내용도 얻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이들 현실 내용에는 모두 진짜라고 할 실체가 없다.
또한 실재영역에도 진짜라고 할 실체가 없다. [원성실상의 승의무자성]
그래서 각 내용이 모두 실답다고 할 만한 성품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3 무자성의 내용을 제시한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실다운 내용이 아님을 파악한다.
처음 의사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의 정체를 찾아 살폈다.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실다운 고통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본래 생멸과 생사고통이 모두 실답게 있는 것이 아님을 본다.
즉 생사현실에는 본래 생멸과 고통이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본래 니르바나다.
이렇게 제시하게 된다.
다만, 일반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분명 환자가 처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환자가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호소한다.
그런데 의사가 그런 현실이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고 제시한다.
즉, 본래 실다운 고통을 얻을 수 없다.
생사고통은 망집을 일으킨 이의 관념 영역안의 일이다.
즉, 망상분별 안에만 있는 망상적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고통의 문제를 살핀다.
그래서 일체는 본래 니르바나(열반)의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의사의 주장을 여전히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은 다음 이유 때문이다.
이는 망상분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앞의 비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감각현실>만 얻는다.
그리고 환자가족은 그를 바라보고 생각을 일으킨다.
이 경우 이 각 내용은 별개 주체에게 각기 따로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주체는 이들 두 내용을 함께 얻는다.
그런 가운데 <감각현실>과 관념내용 둘을 결합시켜 대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 이런 망상분별의 문제가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을 관련부분에서 반복해 살피게 된다.
[참고 ▣-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망상분별을 일으킴]
[참고 ▣-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참고 ▣- 무상삼매 ]
[참고 ▣- 관념이 실답지 않은 사정 - 환자와 가족의 비유를 통한 이해]
다만 현실에서 이런 망집이 일반적으로 잘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를 살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진을 살펴보자.
사진에는 꽃이 져 있는 모습과 피어 있는 모습이 함께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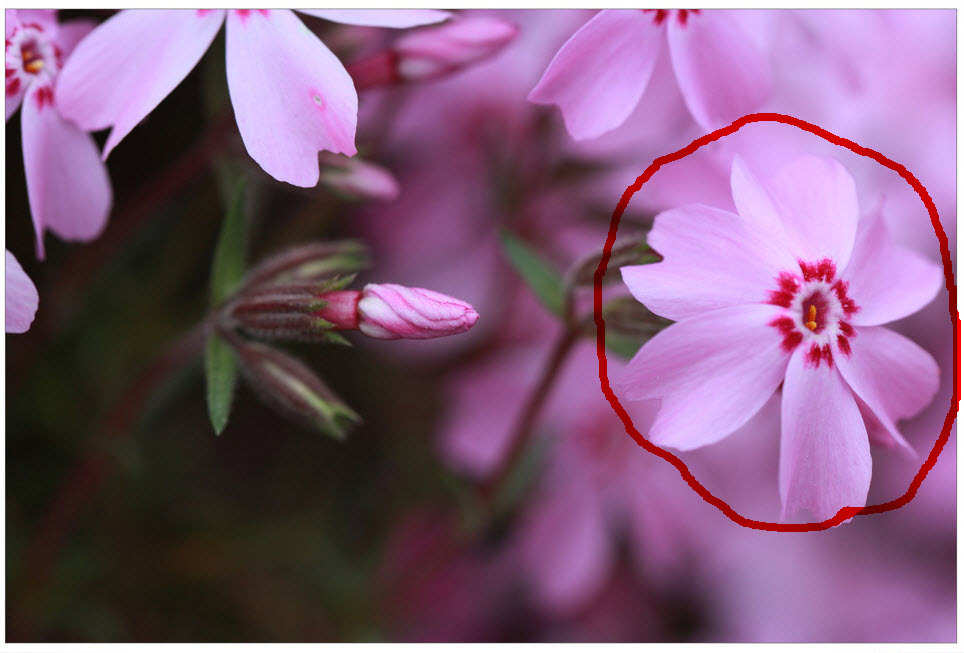
[IMG6] [그림] 꽃 08pfl--image/꽃의핌과생멸.jpg
- 참고 - 『잡아함경』해설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
그림에 약간 특수한 장치를 하였다. 꽃이 핀 원 부분을 클릭하면 위 사진이 원래 제시된 페이지 부분으로 옮겨 간다.
어떤 이가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는 <감각현실>이다.
그리고 이를 대해 일정부분이 꽃이라고 여긴다.
한편 꽃이 피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꽃이 핀 상태를 본다.
그러면 꽃이 핀다고 여긴다.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
그래서 <생멸>을 분별한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관념내용이다.
<감각현실> 안에 그런 관념은 없다.
그리고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감각현실>을 떠나 그런 관념을 얻는 것도 아니다.
또 반대로 관념도 <감각현실>이 아니다.
관념에도 그런 <감각현실>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다음처럼 제시한다.
이 상황에 그런 꽃이나 생멸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제시한다.
그러면 이를 대단히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
이런 경우 다음처럼 반문하게 된다.
지금 자신이 꽃을 보고 있다.
그런데 왜 꽃이 여기에 없다고 하는가?
그런데 그 부분이 꽃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꽃이 없다가 새로 생겨난 것을 다 보았다.
그런데 꽃이 피고 짐(생멸, 생사)을 왜 얻을 수 없다고 하는가?
이것이 없던 꽃이 피어난 것(생겨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한다.
그리고 의아하게 여기게 된다.
현실에서 근본 무명 어리석음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일정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러다가 눈을 감는다.
그러면 직전에 얻던 내용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눈을 뜰 때 얻고 감으면 사라지는 내용은 감각내용이다.
즉, 이는 시각적 <감각현실>(색)이다.
시각적 <감각현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떠올릴 수 없다.
다른 <감각현실>(청각ㆍ후각ㆍ미각ㆍ촉각)도 이와 마찬가지다.
한편, 눈을 떠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이후 이에 바탕해 일정한 관념분별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취해 스스로 자신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세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또 일정부분을 대해 꽃이라고 생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관념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희, 철수, 산, 바위 등의 관념을 일으킨다.
또 있다ㆍ 없다ㆍ이다ㆍ아니다ㆍ같다ㆍ다르다 등의 관념도 일으킨다.
또 생멸ㆍ생사나 온다ㆍ간다 등의 관념도 일으킨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관념내용이다.
이런 경우 이런 관념적 분별을 불교 용어로 '변계소집상'이라고 표현한다.
오늘날 '관념', '분별', '판단'이란 표현에 해당한다.
이런 관념은 감관을 닫은 상황에서도 계속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꽃이란 관념을 눈을 감고서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관념내용과 <감각현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관념은 <감각현실>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관념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관념내용이 <감각현실>에도 그대로 있다고 잘못 여긴다.
더 나아가 <감각현실>의 일정 부분이 곧 그런 관념내용이라고 이해한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꽃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감각현실> 일정부분을 손으로 가리킨다.
이것이 현실에서 상을 취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감각현실> 부분이 곧 그런 꽃이라고 잘못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관념을 <감각현실>에 관통시켜 결합해 대한다.
그리고 그런 <감각현실>의 일정부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 그 관념들은 일정 <감각현실>을 가리키게 된다.
그렇지만, 정작 그 부분은 <감각현실>이다.
<감각현실>은 관념이 아니다.
그리고 <감각현실>에는 그런 관념은 들어 있지 않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관념내용에서는 그런 <감각현실>이 없다.
그리고 관념내용은 그런 <감각현실>이 아니다.
<감각현실>과 관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이런 혼동을 일으키는 사정이 있다.
<감각현실>에 바탕해 관념을 일으킨다고 하자.
우선 이런 경우 그런 관념은 <감각현실>을 떠나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주체 입장에서는 다른 <감각현실>에서 그런 관념을 잘 얻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정부분을 대해 일정한 관념을 반복해 일으킨다.
또한 이런 경우 관념과 <감각현실>은 함께 그 주체의 마음에 머문다.
그런 사정으로 이 두 내용을 서로 접착시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다음처럼 잘못된 망상분별을 일으키기 쉽다.
먼저 관념과 관련해 다음처럼 잘못 분별한다.
<감각현실> 일정부분에 관념이 '있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또 <감각현실> 일정부분은 그런 관념'이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그러나 <감각현실> 영역에 그런 관념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그런 <감각현실>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이를 망상 분별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이런 망상분별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런 경우 관념을 실다운 내용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실답게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집착을 일으키고 묶이게 된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경전에서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
구름 덩어리라 함은 덩어리가 아니언만
구름 덩어리라고 이름한 것이니
어찌하여 구름 덩어리라 하는가.
그것은 본래 각기 다른 부분이 모여 이룩된 형상인 까닭이니라.
어떤 것이 갖가지 다른 형상인가.
그것은 갖가지 형상으로서
모두 광대하다고 미혹되어 상속한 것으로,
그 가운데 작고 큰 모양을 얻을 수 없느니라.
네가 저 구름 덩어리를 보아라.
광대한 모양[廣大相]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모양이 아니니라.
만일 생각이 없으면
다만 궁극적으로 보아,
광대한 모양이라 함은
실로 구름 덩어리가 아닌 것이다.
...
(『대보적경』 삼률의회三律儀會 K0022 T0310)
K0022V06P0005b13L;
...
言雲聚者。
則為非聚故名雲聚。何名雲聚。以其各別起相狀故。
云何種類各別相狀。以種種相皆是廣大。
迷惑相續。而於其中無少大相以為可得。
汝觀雲聚起廣大相。則為非相。若非想者。
但由畢竟廣大之相。非實雲聚。
...
또 이어 다음 내용이 나온다.
...
가섭아,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같이 그늘진 곳에 나아가 앉겠는가.'
슬기로운 이는 말하기를
'그늘이란 형상 없는 것이니 어떻게 가서 앉겠느냐?'
그 사람은 말하기를 '
나는 그늘의 형상을 말한 것이 아니요,
다만 이 그늘진 곳이라고 말하였노라.'
그때에 슬기로운 이가 다시 말하기를
'네가 말한 그늘이란 것이 곧 그늘이 아니니라'고 하느니라.
가섭아, 네가 저 사람을 보아라.
오히려 이렇게 세속을 따라서
능히 깨우쳐 주기를 이와 같이 하도다.
이와 같이 가섭아,
여래는 여실히 모든 법의 진실 이성(眞實理性)을 깨달아 알고
대중 가운데서 사자후(獅子吼)를 하느니라.
가섭아,
여래가 법에 수순하여 머무르기를 즐겨하지만
상(想)에 따르지는 않느니라.
모든 중생이 지닌 아상은
여래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의(第一義)가 되나니,
그 까닭은 여래는 이제 이미 저 생각을 알고
일체 중생의 생각이 곧 생각 아님을 아느니라.
이것이 가장 그윽한 비밀의 말이니라.
혹 어리석은 사람이
이 이치를 등지고 여래와 다투려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세상이 나와 다툴지언정
내가 세상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느니라.
...
(『대보적경』 삼률의회三律儀會 K0022 T0310)
일반적으로 각 주체는 자신, 자신의 생명, 목숨에 대해 가장 집착을 갖는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다음처럼,
이런 관념적 집착을 갖는 이는 보살이 아니라고 제시한다.
...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아상(我相)ㆍ인상(人相)ㆍ중생상(衆生相)ㆍ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
( 『금강반야바라밀경』 K0013)
K0013V05P0979b04L;
....
須菩提!
若菩薩有我相、人相、眾生相、壽者相,即非菩薩。
....
이런 내용도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주체가 가장 집착하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자신, 사람[-보특가라- 윤회의 주체], 생명, 목숨 등이다.
이는 그 주체가 갖는 모든 집착의 근원이 된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 대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들이 실답게 <감각현실> 영역에서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실재 본바탕에도 그처럼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들이 실체가 있는 진짜의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집착을 일으켜 생사현실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중생을 제도하려고 생사현실에 임하는 수행자라고 하자.
그런 경우 적어도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감각현실>과 관념을 재료로 일으킨 망상분별이다.
그런데 이런 망상분별은 다른 영역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일으킨다.
<감각현실>과 관련해서는 다음처럼 잘못 분별한다.
관념에 그런 <감각현실>이 '있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즉, 관념은 <감각현실> 일정부분을 그 구성요소로 '갖는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그리고 <감각현실>을 외부의 객관적 실재로도 잘못 여긴다.
즉 자신이나 철수 등이 다 함께 대하는 외부 실재로 여긴다.
한편, 이들 내용이 자신이 얻어낸 마음내용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마음 밖 실재에 그런 내용이 그처럼 있다고 여긴다.
또는 적어도 현실과 유사하거나 비례하는 내용이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사정이 이와 같기에 그처럼 <감각현실>을 얻는다고 여긴다.
그래서 본바탕 실재에 그런 내용들이 실답게 있다고 여긴다.
즉, 실재영역에 관념이나 <감각현실>이 그처럼 '있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그리고 <감각현실>이나 관념은 각기 실재의 지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그래서 이는 꿈과는 성격이 달리 실다운 내용으로 여긴다.
즉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 이들에 참된 진짜 실체가 '있다'라고 잘못 분별한다.
더 나아가 이는 꿈과는 다른 참된 진짜 내용으로 잘못 여긴다.
또는 참된 진짜의 실체가 그 안에 들어 있다고도 여긴다.
그래서 이는 꿈과는 성격이 다른 실다운 내용이라고 여긴다.
이를 3성의 관계로 표현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 주체가 관념(변계소집상)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 이 내용을 <감각현실>(의타기상)에 관통시켜 결합시킨다.
더 나아가 이들 내용이 곧 실재내용(원성실상)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현실에 생멸과 생사가 있다고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그런 망상분별을 고집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 내용에 집착을 갖게 된다.
그런 경우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업(뜻, 말, 글, 행위, 태도)을 행한다.
그리고 그 업으로 인해 세세생생 고통의 윤회과정을 밟아 나간다.
그런 바탕에서 각 주체는 생사고통을 실답게 겪는다.
이런 경우 생멸하는 생사현실 일체가 고통과 관련된다.
망집에 바탕한 생사고통을 해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본 사정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 각 내용의 관계를 다음처럼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해야 한다.
현실에서 이들 각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할 내용이 아니다.
<감각현실>과 관념은 현실에서 각 영역에서 그처럼 일으켜 얻는다.
<감각현실>을 그처럼 생생하게 얻는다.
또 그 상황에 그런 관념도 명료하게 얻는다.
또한 실재도 마찬가지다.
비록 실재를 한 주체가 직접 얻어내지는 못하다.
따라서 있다 없다 등의 분별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재가 아무 것도 전혀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서로 상호 관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일정한 관념은 <감각현실>을 떠나 얻는 것이 아니다.
한편, 본바탕 실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감각현실>과 관념은 실재를 떠나 얻는 것이 아니다.
실재도 <감각현실>과 관념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본래 서로 분리되는 별개의 내용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서로의 내용을 대조하면 대단히 엉뚱하다.
그래서 이들은 침대에서 누어 꾼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접착시켜 이해할 내용이 아니다.
현실 내용이 꿈과 마찬가지로 실답지 않다.
이 사정은 이미 살폈다.
한편 그럼에도 이런 현실을 실답게 잘못 여기게 되는 배경사정이 있다.
이 내용도 이미 살폈다.
중복을 피해 이들은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참고 ▣- 실답지 않음의 판단 )
(참고 ▣- 생사현실을 참된 진짜이고, 실답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정)
여하튼 이런 사정을 잘 관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 집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 열반과 다양한 수행목표 선택 문제
현실에 다양한 생사고통이 문제된다.
그 원인은 이렇다.
본래 실상에서는 생멸이나 생사 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청정한 니르바나 상태다.
그래서 본래 문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주체가 근본 무명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망집 번뇌를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따라서 본래의 니르바나 상태를 망집이 덮어 가린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각 주체가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분별을 행한다.
또 그런 가운데 다시 망상 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집착을 갖는다.
그럼으로써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따라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근본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본래의 니르바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하다.
그런데 어떤 이가 잠만 들면 악몽에 시달린다.
그런데 그 꿈을 깨어난다.
그런 경우 꿈에서 겪은 악몽이 사라진다.
그리고 본래의 현실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꿈에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현실에는 본래부터 꿈과 같은 내용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본래부터 평온한 상태였다.
생사현실도 이와 마찬가지다.
현실에서 망집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멸현상이 멸하고 열반을 증득한다.
이런 경우 그 열반은 본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곧 설산동자의 게송과 같다.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부분이다.
여기서 다음처럼 제시한다.
나타나고 멸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적멸이 즐거움이 된다,
본래 실재는 2분법상의 분별을 떠난다.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아 청정하다거나 즐겁다고 표현할 수도 없다.
본래 바탕은 모두 청정한 진여 니르바나다.
그러나 망집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한 내용을 취해 자신과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경우 그런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에 생멸과 생사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
오염된 내용이다.
이런 경우 본바탕인 니르바나 상태를 망집이 덮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생사현실 문제다.
그러나 실재는 그것을 떠난 상태다.
따라서 실재는 이런 현실내용에 상대하여 청정하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안온하며 즐겁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해결할 방안을 살펴야 한다.
그것이 곧 수행방안이다.
이 상황을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 본바탕은 깨끗하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천을 덮었다.
그리고 여기에 온갖 잘못된 내용을 적어 놓는다.
그리고 그로 인해 번뇌를 일으키고 행위한다.
그리고 이후 또 다음 천을 마련한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내용을 적어 나간다.
그런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본바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렇지만, 이는 여전히 문제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3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그 천을 걷어내 깨끗한 바탕만 남긴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런 천을 만들어 덮지 않는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회신멸지의 니르바나]
또 다음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천위에 선을 그어 잘못된 내용이라 표기한다.
그리고 본바탕에 상응하는 깨끗하고 올바른 내용만 적어 넣는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던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 천과 그 내용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수행자 개인만을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런 방안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위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다른 천들도 함께 깨끗해질 방안을 추가로 찾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과 <생사 즉 열반>
자비심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들을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자신의 해탈 열반만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복덕과 지혜를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법신을 증득하고 성불함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이를 위한 수행방안이 필요하다.
불교에서 해탈을 이루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당면 목표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라한과 연각, 부처의 상태가 있다.
이들은 모두 해탈과 열반을 증득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아라한과 연각은 자신의 해탈, 열반을 성취한 상태다.
반면, 보살과 부처는 모든 생명을 생사고통의 윤회에서 제도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중생들이 열반을 얻게 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 복덕과 지혜에 다시 차별이 있다.
따라서 보살과 부처를 수승한 상태로 보게 된다.
더 나아가 부처를 가장 이상적 상태로 보게 된다.
이는 복덕과 지혜를 원만히 성취하고 법신을 증득한 상태다.
따라서 수행시 이런 여러 상태를 나누게 된다.
그런 바탕에서 수행 방향을 찾아 나가게 된다.
자신이 병이 걸려 있다.
이런 경우 당장 자신의 병만 낫는 것을 목표로 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이는 다른 이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의사를 통솔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장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또는 의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의대 교수나 총장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가 일정한 성품을 지니고 의사 자격을 얻는다.
그러면 의사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 갖출 성품이 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구체적 의사 개개인과 별개로 추상적으로 따로 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그런 상태를 증득한다.
그러면 비로소 의사가 된다.
수행도 사정이 같다.
각 개인은 처음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수행을 한다.
그리고 수행 목표를 증득한다.
그러나 각 개인의 목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생사현실은 본래 청정한 진여 니르바나다.
그럼에도 어떤 이가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경우 그 가운데 일부분을 스스로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대상이나 외부 세계라 잘못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래서 망집을 바탕으로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니르바나를 얻기 위해 다음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있다.
각 주체는 일정한 근본정신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 망집을 일으켜 업을 행해간다.
그래서 이런 망집번뇌를 모두 제거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망식도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근본정신과 공한 실재, 진여만 남겨 둔다.
그렇게 회신멸지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본 상태인 니르바나 상태로만 임하게 된다.
한편, 다음 방안도 가능하다.
생멸하는 현실에 그대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본래 생멸이 없고 니르바나임을 관한다.
그래서 분별과 집착을 버린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그대로 번뇌와 고통에 물들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두 방안 가운데 어떤 방안이 나은가
자신의 고통의 소멸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회신멸지의 니르바나를 더 완전하다.
그러나 회신멸지의 상태에서는 다른 생명을 제도하기 곤란하다.
중생을 구제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중생이 머무는 생사현실에 들어가 같이 임해야 한다.
따라서 뒤의 방안이 낫다.
경전에서는 다음처럼 제시한다.
보살 일천제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자비심을 갖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런 경우 그 자신이 열반에 들면, 중생제도가 곤란하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관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사고통을 벗어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도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해나간다.
♥Table of Contents
▣- 생사고통의 해결과 꿈의 비유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생사현실에 임해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관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벗어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의 상태로 머문다.
이는 꿈의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꾼다.
그런데 어떤 이가 꿈을 깬다.
그래서 꿈을 깨면 그것이 꿈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꿈을 꿀 때는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런 경우 여전히 꿈에 들면 문제가 반복된다.
그런 경우 이후로는 꿈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늘 깬 상태로 지내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가 다음처럼 노력을 한다.
그래서 꿈을 꿀 때도 그것이 꿈임을 알고 꿈을 꾼다.
그러면 설령 꿈을 꾸더라도 꿈을 깬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
생사현실의 수행도 사정이 같다.
어떤 수행자가 생사현실에서 그 본바탕이 니르바나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꿈과 같음을 잘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한다.
이런 경우에 그 사정을 이처럼 잘 관한다.
그리고 이를 평안히 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 일체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곤란하다.
생사현실에서 비교적 안락하게 있을 경우는 이는 큰 관계가 없다.
그런데 생사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생생하게 고통을 겪어 나가게 된다.
이는 다음 비유 상태와 같다.
꿈을 깨면 꿈인 것을 안다.
그러나 꿈꿀 때는 그것을 모른다.
그래도 꿈이 악몽이 아닐 때는 별 관계없다.
이런 경우와 같다.
이 어느 경우나 본 상태는 니르바나다.
생사현실은 본래 니르바나 상태다.
생사현실의 본바탕이 니르바나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생사현실은 본래 니르바나 상태다.
그래서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망집을 일으킨 이는 이에 바탕해 생사현실을 생사고통으로 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니르바나 상태에 이르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일단 생사현실 안에서 수행을 해나가게 된다.
그런 경우 일단 생사현실에서 3악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쌓여진 업장을 제거하는 수행을 닦아야 한다.
그 다음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ㆍ정ㆍ혜 3학을 닦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먼저 망상분별과 번뇌와 집착을 없애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근본적인 망집번뇌까지 수행을 통해 남김없이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끝내 회신멸지의 상태로 반열반에 들어 생사현실에서 벗어난다.
그래야 근본정신(아뢰야식)이 이후 다음 생을 받아나가지 않게 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생사현실 안에서 수행을 해나가야 한다.
이 경우는 그 자신부터 일단 3악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먼저 자신부터 생사현실에서 망상분별과 번뇌와 집착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는 회신멸지의 반열반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한편, 정려 수행 등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방편을 써서 <생사고통을 받는 중생이 있는 욕계 생사현실 >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과 입장을 같이 해야 한다.
그 다음 일단 생사현실에서 니르바나 상태처럼 여여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서 다시 복덕자량과 지혜 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또 중생제도를 위해 무량행문을 닦고 다라니 삼매 신통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법신을 증득해 성불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다음은 기본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공통된다.
즉 어느 경우나 수행을 통해 3악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망상 분별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와 집착을 제거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후 두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방향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에서의 문제점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먼저 이론적으로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한다.
이론상 <생사 즉 열반>은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제시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어떠한 상태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생에 임하는 한, 현실에서 여전히 감각이나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한편 평소 안락한 상태에서는 세속의 다른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극심한 고통에 처할 경우는 차이를 보인다.
<생사 즉 열반>은 이런 경우마저도 생사현실이 니르바나임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극심한 생사고통을 평안히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론을 현실에 실증해 인가한 상태가 된다.
그래야 생사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을 닦아 나간다.
그런데 <생사 즉 열반>은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니르바나임을 제시한다.
그런데 <생사 즉 열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하자.
즉 이 내용만 따로 떼어 치우쳐 강조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로 인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그런 경우들로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 생사현실 일체가 니르바나다. 따라서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착각하고 머물기 쉽다.
- 생사현실은 망집에 바탕해 전개된다. 그래서 문제 상태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오로지 좋은 부분만 취해, 낙관적으로 안주하려 하기 쉽다.
- 수행을 행한다. 그런데 수행중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한다. 그런 경우 처음의 망상분별과 집착의 상태로 다시 물러나기 쉽다. [퇴전]
- 생사 즉 니르바나다. 그래서 이에 바탕해 현실에서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해서도 평안히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일체 생사고통에 오로지 평안히 참는 것만을 수행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고행수행으로 일관하려 하기 쉽다.
- 생사현실에서 오직 니르바나의 측면만 취한다. 그래서 없음에 지나치게 치우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소극적 자세로만 임하려 하기 쉽다.
- 개인적으로 망상분별 집착을 떠난다. 그러나 생사현실이 니르바나다. 따라서 다른 생명이 고통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고 현실을 외면하기 쉽다.
- 망집을 떠난다. 그런 이상 생사현실에서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막행막식하기 쉽다. (악취공견)
이런 등이 <생사 즉 열반관>에 바탕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관>으로 수행할 경우 이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현실 그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함
일체 현상이 모두 본래 니르바나다.
즉, <생사 즉 열반>이다.
이는 일체 생멸현상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말한다.
그래서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다.
본바탕에서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차별을 얻지 못한다.
생사현실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못 얻거나 마찬가지다.
차별을 세울 수 없다.
본바탕은 여전히 차별 없이 니르바나 상태다.
그래서 본바탕 측면에서는 생사고통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바탕 측면에서는 그런 생사고통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러나 한편, 이 내용은 다음 사실도 함께 제시한다.
본 사정은 그렇다.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문제는 생사현실이다.
본바탕이 그러함에도 생사현실에서는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본래는 니르바나이다.
그런데도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 즉 열반>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망상분별과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업을 행한다.
그래서 생사윤회 고통을 받아나간다.
이런 경우 생사현실은 문제다.
그리고 위 내용은 이런 사실도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생사 즉 열반>과 반대다.
본래 니르바나인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열반 즉 생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사현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사현실에서 해결할 문제가 된다.
그런데 생사현실에서 그런 차이는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일으키는가 여부>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생사현실 안에서 깨달음에 바탕해 임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그로 인한 차이는 생사현실 안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생사현실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 즉 열반>임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이를 꿈에 비유해보자.
본래 꿈은 현실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꿈이 꿈인 줄 모르고 꿈을 꾼다.
그러면 악몽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것이 꿈임을 알고 꿈을 꾼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에서 꿈을 대하는 상태와 같아진다.
따라서 생사 현실 안에서의 깨달음이 중요하다.
즉, 생사현실에서 <생사 즉 열반>임을 '깨닫고 이해함'이 중요하다.
깨달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도 생사고통을 벗어나 임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도 다시 본래의 니르바나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 즉 열반>은 이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따라서 <생사 즉 열반>은 생사현실 일체가 그대로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는 생사현실이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런 수행이 필요 없다고 제시한 것이 아니다.
또 망상분별과 집착 속에 살아가도 무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어도 무방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 안에서 그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깨닫고 이해함'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한 생사고통 문제를 잘 해결해가야 한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의 가르침은 다음을 의미한다.
생사현실은 본래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생명이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러면 본래 니르바나임에도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이 경우는 <열반 즉 생사고통>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가 본래 니르바나임을 깨닫고 임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니르바나 상태로 여여하게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사고통 즉 열반>이 된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의 내용은 위 내용 전체를 함께 묶어 이해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전체 내용 가운데 앞부분 하나만 따로 떼어 취한다고 하자.
즉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니르바나다라는 내용에서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많다.
즉, 오직 첫 부분만 떼어내 강조한다고 하자.
즉 <생사현실 일체가 니르바나다>라는부분만 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음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생사현실은 곧 니르바나다.
이 표현만 보면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니르바나여서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런 결과 생사현실에서 망상분별과 집착을 일으켜도 무방하다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겪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이런 망집을 제거할 필요도 없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 사정으로 수행 노력은 전혀 필요 없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아무렇게 그냥 살아가도 다 무방하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 사정으로 잘못된 방향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수행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망집을 일으켜 현실에 임하던 상태로 그대로임하려 하기 쉽다.
현실에서 대부분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이성적, 감성적인 분별(망상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이에 집착을 갖고 업을 행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좋음을 집착하여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생명에게 좋음을 베풀 생각을 갖지 못한다.
2. 또 자신의 좋음을 집착하여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좋음(생명, 신체, 재산, 가족...)을 함부로 침해한다.
3. 한편 앞과 반대로 자신이 집착하는 좋음이 침해되고 나쁨을 받게 된다.
그러면 분노, 슬픔, 원한, 억울함, 미움과 원망을 갖는다.
그리고 상대에 보복 가해를 행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사현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처럼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런 상태에서 <생사 즉 열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고하자.
그러면 이처럼 망집에 바탕한 자세가 무방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이처럼 잘못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런 상태는 모두 문제 상태다.
그런 경우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일체가 니르바나다.
이는 생사고통이 본래 얻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업을 행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그런 고통을 겪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생사 즉 열반> 이론을 이처럼 극단적으로 취하려 한다고 하자. 즉 이처럼 망집에 바탕한 경은 마저도 무방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다시 이 내용을 보충해서 다음처럼 바꿔 대해야 한다.
본래 생사현실은 니르바나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 즉 열반>인 사정을 깨닫고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러면 그런 생사고통마저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 사정을 모르고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러면 그런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반대로 <열반 즉 생사>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바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론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곤란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즉 <생사 즉 열반> 이론이 제시된 취지를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를 통해 오히려 처음의 망집 상태로 나아가기 쉽다.
♥Table of Contents
▣- 망집에 바탕한 단순한 낙관주의
<생사 즉 열반>은 다음을 의미한다.
생사현실은 본래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생명이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러면 본래 니르바나임에도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이 경우는 <열반 즉 생사고통>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가 본래 니르바나임을 깨닫고 임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니르바나 상태로 여여하게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사 현실 즉 열반>의 상태가 된다.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의 내용은 위 내용 전체를 함께 묶어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내용 가운데 앞부분 하나만 따로 떼어 취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내용을 다음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즉, 생사현실은 곧 니르바나다.
그래서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니르바나다 .
따라서 생사현실이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제시한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임하는 현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 쉽다.
또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를 그대로 긍정하려는 자세로 잘못 여기기 쉽다.
그리고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무조건 낙관적으로 임하려는 자세로 오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현실에는 좋음과 나쁨이 뒤섞여 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가 좋은 부분만을 찾아 초점을 맞추고 임한다.
그래서 현실이 어떤 내용이던 그대로 두고 좋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의 나쁜 내용마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단순히 낙관주의 입장으로 임한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현실에서 올바른 수행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 망집에 바탕한 단순한 낙관주의
망집에 바탕해 취하는 단순한 낙관주의는 다음과 같다.
한 주체가 망상분별과 집착을 바탕으로 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좋음과 나쁨에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좋음을 집착한다.
그리고 좋음을 집착하여 찾고 구한다.
그래서 나쁨을 외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현실에서 좋은 점에만 초점을 맞추려 노력한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긍정하려 한다.
그런 입장으로 낙관적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게 되기 쉽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매 경우 다음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좋은 것은 좋아서 좋다.
한편 좋은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현실에서 숨겨져 있는 좋은 면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 현실을 좋게 생각할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 들어가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나쁜 것이 있다.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
그래서 언젠가 사라진다.
그래서 좋다.
또 이를 나쁜 다른 일들과 비교한다.
그래서 이를 좋다고 여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을 더 큰 나쁨과 비교한다.
또는 또 다른 종류의 나쁨과 비교한다.
또는 그것이 없었으면 대신 있었을 나쁨과 비교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도 좋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한편, 이미 이루어진 좋음에만 오직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오로지 그 측면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쁜 측면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있다.
또 앞으로 좋음을 가져다 줄 측면을 미리 내다 본다.
그리고 미리 그 성취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취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또 성취될 수 있는 원인을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 않은 상태를 성취된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또 한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변화한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좋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현실은 나쁨과 좋음이 뒤섞여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세는 이 가운데 좋은 측면만 일부로 찾아내는 입장이다.
그런 노력을 통해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임하려는 방안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
그리고 낙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망집에 바탕한 자세다.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반복해 받아나간다.
망집에 바탕한 현실은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놓고 오로지 좋은 면만 찾아낸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현실을 그대로 긍정해 방치한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망집에 바탕한 낙관주의는 극단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다른 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그런 상태는 좋지 않다.
또 그런 일을 행하면 체포당한다.
그리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를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그 상태도 밥은 먹는다.
그런 부분을 취해 좋다고 여긴다.
한편, 그런 이가 붙잡혀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도 자신이 영원히 갇혀 있지 않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풀려날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런 자세도 낙관주의다.
한편 예를 들어 현재 가난한 이가 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한다.
그런 가운데 언젠가 자신도 부자가 되리라고 낙관하며 임한다.
또는 어떤 이가 원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상 그 원한을 갚지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 복수할 날이 있으리라 여긴다.
그런 가운데 낙관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망상분별에 바탕한 상태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을 지닌다.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를 일으켜 집착한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이 경우 망상분별과 집착이 문제가 된다.
즉, 집착하는 바를 이루기 전까지 갈증과 불쾌를 느낀다.
그리고 집착하는 바가 무너질까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
또 집착하는 바가 무너져 사라지면 고통과 불쾌를 받게 된다.
그런 가운데 당장의 좋음에 집착한다.
그래서 더 큰 나쁨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현실에서 고통을 없애지도 못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 고통을 더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런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망집에 바탕해 그런 집착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좋은 측면만 취한다.
그리고 이를 그대로 긍정한다.
그리고 문제를 외면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핸 생사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생사고통을 그대로 겪게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상태를 더 악화시켜 나가기 쉽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 <생사 즉 열반>관과 낙관주의의 차이점
<생사 즉 열반>은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제시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을 긍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단순한 낙관주의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생사 즉 열반>은 이런 자세와는 구별해야 한다.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망상분별과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래서 장차 생사고통을 장구하게 겪어 나간다.
이는 생사고통을 겪어 나가는 문제 상황이다.
그런데 낙관주의는 현실에서 좋은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런 가운데 무조건 현실을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망집에 바탕해 문제 상황에 그대로 안주하려는 자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 그런 현실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기 쉽다.
그리고 문제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생사 즉 열반>은 이런 자세와는 구별해야 한다.
불교는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관한다.
그리고 망집을 바탕해 겪는 생사고통을 문제로 본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해가는 현실을 문제로 본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추구하는 세속적 목표도 부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생사현실의 이런 문제점을 올바로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현실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
따라서 현실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망집에 바탕해 현실을 낙관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관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다만 비관주의가 또 불교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참고 ▣- 비관주의와 불교의 차이)
단순한 비관주의는 망집에 바탕해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반대로 생사현실을 긍정한다.
예를 들어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한 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업장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행은 일단 생사현실에서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수행과정에서 생사현실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탐욕이 일어나도 이를 끊어야 한다.
또 분노가 일어나도 평안히 참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우선 당장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사 즉 열반>을 관한다.
그리고 수행중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수행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중생들이 생사고통을 벗어나게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량행문을 닦아야 한다.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선교방편을 통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사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다.
그래도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생사현실을 받아들여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생사 즉 열반>을 관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실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한다.
그래서 현실을 긍정하며 수행에 임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은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망집을 문제로 본다.
그래서 이를 부정하고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
그래서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관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 생사고통이 본래 실답게 있지 않음을 관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즉 그런 깨달음에 바탕해 망집에 바탕한 자세를 부정하고 버린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 2중적 측면을 갖는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외관상 긍정으로 보이게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한 업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
깨달음에 바탕한 수행자는 망집에 바탕해 행하는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수행을 행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당장 생사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생사 즉 열반>은 그런 경우 당장 겪는 생사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현실을 긍정하는 입장은 이 경우 모두 이와 반대로 임하게 된다.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는다.
단순한 낙관주의는 이런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세가 된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다만 수행자가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는 자신과 중생에 대해 2중적으로 임하게 된다.
수행자는 현실에서 망집을 제거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중생은 망집에 바탕해 있다.
그리고 그 망집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당장 곧바로 망집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할 경우 방편상 그런 중생의 상태를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중생의 현실이 문제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 이를 긍정하는 자세로 대한다.
그리고 그 장래에 낙관적 자세를 취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현재 상태만 보면 대부분 생명이 많은 번뇌와 집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그렇지만, 모든 생명은 장차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을 찾아내 상대를 긍정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망집에 바탕한 생사고통을 점차 벗어나게 함에 목표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생사현실을 좋게 여기고 안주하는 자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 즉 열반>관에 바탕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을 무조건 긍정하며 낙관적으로 대하기 쉽다.
그리고 망집 상태에 마냥 안주하려 하기 쉽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중 망상분별과 집착 상태로 다시 물러남[퇴전]
생사에 머물면서 생사가 곧 열반임을 관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들어가 중생과 입장을 같이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을 한다.
그런데 생에 임하는 한, 일반 중생과 기본적으로 같은 상태에 놓인다.
즉, 현실에서 일반 중생과 마찬가지로 감각이나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는 생을 출발하기 전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근본적인 망집을 이런 바탕에서 일으킨다. [구생기 신견, 변견, 탐, 진, 만 의]
그래서 생에 임하는 한, 이런 바탕에서 일정한 감각이나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가운데 수행자도 역시 망상분별과 집착을 일으켜 갖기 쉽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이런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망상분별과 집착을 떠난 상태에 늘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음 현실에 임한다.
그런데 망집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바탕한다.
그런데 수행은 이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를 제거함이 기본이다.
그런데 망집 상태에서는 이 자체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감정적 정서적 본능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행하던 업을 중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함에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다시 일반의 상태로 물러나기 쉽다.
즉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의 상태로 다시 물러나기 쉽다.
이는 그간의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서다. [훈습된 습기(習氣)]
그래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 경우 수행을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망상분별과 번뇌 집착의 상태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꾸준히 머물러야 한다. [불퇴전위]
그런데 아직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생사 즉 열반관>을 잘못 이해한다.
그러면 망집상태로 임하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망집상태로 임하던 상태로 다시 물러나기 쉽다.
이는 현실적으로 수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임한 상태가 더 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가 성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자.
이는 수행의 기본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경우 <생사 즉 열반관>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또 이런 경우는 공 무상 무원무작 해탈삼매를 닦는 것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이들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해를 해도 불완전하게 이해한다.
이런 사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즉, 일체가 다 니르바나다.
이런 부분을 대한다.
그런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오해를 일으킨다.
이는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니르바나임을 뜻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임해도 역시 무방하다고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아무렇게 행해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런 자세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지나친다.
생사현실은 본래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생명이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러면 본래 니르바나임에도 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는다.
이런 측면을 지나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열반 즉 생사고통>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런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곧바로 수행을 포기하고 물러나기 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해결함에 있다.
이를 위해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을 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평안하게 임하고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생사 즉 열반>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Table of Contents
▣- 안인 수행과 지나친 고행주의
한 주체가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은 기본적으로 생사고통에 귀결된다.
따라서 망집에 바탕해 임하는 생사현실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그래도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일단 각 주체는 망집을 갖고 처음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망집과 업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행을 행한다.
그래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날 때까지 현실에 임하게 된다.
한편 수행자가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임한다.
이런 경우 생에 임하는 한 감각이나 분별을 일으키게 된다. [구생기 신견, 변견, 탐,만,진,의]
그런 사정으로 쉽게 일반적인 망집 상태로 물러나게 되기 쉽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생사현실을 피하려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먼저 이치상 <생사 즉 열반>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 된다.
<생사 즉 열반>을 이치상 이해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안락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생사 즉 열반>은 현실에서 극심한 고통에 처할 경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해서 평안히 임하는 안인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자가 안인을 성취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사 즉 열반>의 내용을 이치상 확고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해 그대로 평안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 중 생사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삼매를 통해 색계 무색계로 옮겨가 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욕계 내 생사고통을 임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욕계 생사현실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욕계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해서도 그상태로 그대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행자는 욕계 생사현실 안에서 안인을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안인 수행]
이는 극심한 생사고통을 평안히 참고 임하는 안인 수행노력이 요구된다.[忍 kṣānti]
그런 경우 생멸을 떠난 진여법성을 현실에서 인지(忍知)한 상태가 된다. [무생법인無生法忍]
이런 경우 이론과 현실이 일치된 상태가 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불퇴전위]
그래서 대단히 수준이 높은 수행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 가운데 망집에 바탕해 일으키게 되는 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 생사현실 일체는 모두 문제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생사현실 일체 상황에서 모두 평안히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이후 생사현실에 임해 무량행문을 닦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현실에서 증득함이 갖는 가치가 크다.
그런 경우 무량한 온갖 방편지혜를 쉽게 취득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수행단계에 이르게 된다.
본래 현실에서 방편 지혜는 선악 무기의 성격을 갖는다.
즉 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악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본래 가치중립적인 특성을 갖는다. [무기]
현실에서 물이나 불 등 온갖 방편이 이런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불을 생명을 해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생명을 안락하고 이롭게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망집을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에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수행자는 중생에게 보리(깨달음)를 얻게 하기 위해 방편지혜를 취득해 사용한다.
처음 수행자가 보리심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런데 수행자 자신이 먼저 안인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고통에 처하면 수행자가 쉽게 물러나게 된다.
그런 상태의 수행자가 방편지혜를 지닌다고 하자.
그러면 마치 아이가 귀한 보석을 지니는 경우와 같다.
그러면 이로 인해 오히려 수행자부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망집에 바탕해 방편지혜를 탐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로 인해 오히려 수행자가 침해를 받고 묶이게도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방편을 뺏기기도 한다.
그러면 그 방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자신을 방해하고 해치는 상대를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런 경우 갖고 있는 방편을 오히려 상대 중생을 해치는데 사용하기 쉽다.
그런 경우 그로 인해 자신도 생사고통에 묶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수행자에게는 방편지혜를 직접 제공하기 곤란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행자가 설령 방편지혜를 갖추고 있더라도 다시 제거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의 수행자에게는 방편지혜를 다라니로 묶어 제공하게 된다.
다라니는 암호 주문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다라니는 그 자체로는 방편지혜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알 수 없다.
다만, 이를 배포한 부처님이나 대력보살이 수행자의 상태를 관한다.
그리고 그 방편을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함께 관한다.
그래서 중생제도에 도움될 경우만 방편이 성취되도록 한다.
그래서 일종의 통제 장치가 갖춰진 형태로 방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수행자가 안인을 성취하고 불퇴전위에 이른다.
그러면 상태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는 무량한 방편지혜를 직접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 입장에서는 안인 수행의 성취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안인 수행이 수행자에게 갖는 의미가 크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는 원칙적으로 선교방편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선교방편으로도 도저히 제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수사리보살님과 같이 광대무변한 서원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무간지옥에 들더라도 중생제도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행의 성취를 위해 불가피하게 생사고통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수행자가 이런 생사고통에 처해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곤란하다.
그래서 수행자는 일체 생사 고통에 처해 평안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수행과 중생제도에서 끝내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안인 수행의 성취는 수행자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생사 즉 열반> 입장을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리고 안인 수행이 갖는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하자.
그런데 생사현실에서 극심한 고통의 종류가 무한하다.
그래서 수행자는 생사현실의 온갖 고통을 다 찾아 다니며 참는 수행을 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생사 즉 현실>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이는 고행수행자의 단순한 고행수행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행 수행은 실질적으로 중생제도에 큰 의미가 없다.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행한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를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안인 수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행에 오직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계ㆍ정ㆍ혜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업을 중지한다.
그리고 자신부터 근본 망집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복덕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무량한 방편지혜를 닦아 나가야 한다.
그러면 쌓여진 업장이 제거된다.
그리고 이후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쌓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생사고통은 예방된다.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사고통에 그렇게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어느 정도의 생사고통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런 사정으로 수행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외면해서도 곤란하다.
그래서 수행목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안인 수행을 실천함이 요구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지나치게 안인 수행만 강조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고행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혼동하면 오히려 곤란하다.
원래 생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을 한다.
그리고 다른 중생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수행을 한다.
그런데 수행자가 오히려 무간지옥에 스스로 찾아 들어가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중생제도와 수행의 성취도 곤란하다.
그래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입장은 곤란하다.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수행과 서원을 원만히 잘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수행 목표와 관련해 일정한 안인 수행이 필요한 것 뿐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 <생사 즉 열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먼저 확고하게 갖춰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고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부터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본 수행에 정진한다.
그리고 평소 전방위로 안인의 정신에 바탕해 수행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을 정진해 가야 한다.
그러나 수행목표 성취와 관계없이 고통을 찾아 다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관>으로 없음에 치우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잘못
생사현실에 임해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 즉 열반>을 이해해야 한다.
즉, 일체 현상이 모두 본래 니르바나다.
이런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먼저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상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이 부분이 자신이다.
저 부분은 철수다.
지금 철수가 욕한다.
또는 자신을 해친다.
이런 등등으로 상을 취하지 않는다.
경전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만약 내가 옛날에 몸을 찢길 적에 아상ㆍ인상ㆍ중생상ㆍ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성을 내어 원망하였을 것이니라.
...
( 『금강반야바라밀경』 K0013 T0235 )
또 한편 본바탕 진여는 공하여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이런 실재의 측면을 취해 임한다. [색즉시공色卽是空)]
한편 생사현실의 본바탕이 공하다.
따라서 생사현실은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그래서 이들이 실다움이 '없음'을 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집착을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한편 생사현실에 참된 진짜인 실체가 없음을 관한다.
실재 영역 역시 모두 무아, 무자성이다.[승의무자성]
한편 생멸하는 현상에도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 (무아ㆍ무자성)
또 <감각현실> 일체는 실재가 아님을 관한다. [생무자성]
그리고 관념에 자상이 없음을 관한다. [상무자성]
이처럼 현실이 실답게 볼 특성이 없음을 잘 이해한다. [3무성]
그래서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한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고 생사현실에 여여하게 니르바나의 상태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고 임한다.
그런데 이 경우 또 없음의 극단에 치우치기 쉽다.
그래서 일체가 아무것도 전혀 없다는 견해를 갖기 쉽다.
이처럼 오로지 '없다'는 견해에만 지나치게 치우친다.
그런 경우 오히려 현실에서 없음의 측면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없다고 부정하기만 한다.
그리고 고요함에만 머무르려 한다.
그리고 '없지 않음'이나 '있음'의 측면을 외면하기 쉽다.
그리고 지혜를 키우려 하지 않기 쉽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많은 수행을 외면하려 하기 쉽다.
그리고 무량한 선법을 외면하기 쉽다.
그래서 이에 대해 경전에서는 다음처럼 제시한다.
...
그들은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저버리며,
한결같이 뭇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저버린다.
나(부처님)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와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도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끝내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한결같이 고요함에만 빠지는 성문이라 한다.
'''
만일 모든 생명[유정]들이,
널리 말하건대
내지 아직 상품(上品)의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을 쌓지 못했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다면,
성품이 강직하지 못해
비록 폐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힘과 능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견취(見取)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은 밀의의 말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법에 믿는 마음을 낸다고 해도
그 뜻을 말을 따라 집착해
‘일체 법은 단정코 모두 자성이 없으며,
단정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단정코 본래 고요하며,
단정코 자성이 열반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모든 법에 대하여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을 것이다.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었음으로써
일체 모습은 모두 무상(無相)이라고 부정해 버리며,
모든 법의 변계소집상과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을 비방하고 부정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이 있는 까닭에
변계소집상도 시설할 수 있는 것이니,
만일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을 없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는 또한 변계소집상도 비방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비방하고 부인한다’고 말하니,
비록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긴 하지만
뜻이 아닌 것 가운데서 뜻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뜻 아닌 가운데 뜻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까닭에,
옳은 법 가운데서 옳은 법이라 지니고
잘못된 뜻 가운데서 옳은 뜻이라고 지닌다.
그는 법에 대하여 믿음을 일으킨 까닭에 복덕이 증장하긴 하지만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킨 까닭에 지혜를 잃으며,
지혜를 잃는 까닭에 광대하고 무량한 좋은 법에서 물러난다.
다시 어떤 유정이 법을 법이라 하고
뜻 아닌 것을 뜻이라고 하는 말을 남에게서 듣고 그 소견에 따른다면,
그는 곧 법에서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뜻 아닌 것에서 뜻이란 생각을 일으켜,
법을 집착하여 법이라 하고
뜻 아닌 것을 집착하여 뜻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라,
그들은 함께 선법(善法)에서 물러나리라.
'''
(『해심밀경』 5. 무자성상품無自性相品)
생사현실의 본 바탕은 공하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실답지 않다.
한편 현실에는 승의무자성, 생무자성, 상무자성의 3가지 없음[3무성]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각 영역의 내용에 실답게 볼 특성이 없다.
그런데 이를 통해 오로지 없다는 견해에만 치우치기 쉽다.
그런 경우는 그로 인한 문제가 있게 된다.
본래 청정한 니르바나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생사현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무상한 현실 속에서 밍집을 일으켜 집착한다.
따라서 승의무자성, 생무자성, 상무자성을 제시한다.
이런 3무성을 이해하여 집착을 버린다.
그러면 무상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는 이를 통해 원성실상과 의타기상, 변계소집상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실에는 원성실상과 의타기상 변계소집상과 같이 있음의 측면이 있다.
즉 실답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
따라서 없음과 있음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생사현실에서 기본적으로 수행자 자신부터 생사 묶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해탈과 니르바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생사현실에 남아 고통 받는 중생이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임해 이들 생명을 구제해야 한다.
그런 경우 수행자가 회신멸지의 열반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을 관하고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생멸하는 생사현실이 모두 그대로 니르바나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에 바탕해 생사현실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로지 생사현실에서 니르바나의 상태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다고 하여 오로지 모든 것을 없다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직 고요함에만 빠져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자세는 중생제도를 행하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제다.
<생사 즉 열반>임을 깨닫는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생사현실에 임해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리고 무량행문을 닦고 무량방편지혜를 쌓아야 한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해간다.
그런 가운데 법신을 이루고 성불한다.
그런 가운데 온 생명을 제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량한 선법을 성취해가야 한다
따라서 이런 목표를 갖고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정진하여 나아가야 한다.
경전에서는 각 수행으로 얻는 차별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
해탈신에 의지하는 까닭에
일체 성문이나 독각과 모든 여래는
평등하고도 평등하다고 말하며,
법신을 말미암는 까닭에 차별이 있다고 말하며,
여래의 법신에 차별이 있는 까닭에
무량한 공덕과 가장 수승한 차별이
산수(算數)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
(『해심밀경』 8. 여래성소작사품)
K0154V10P0738c14L;
...
善男子。
名解脫身。由解脫身故說一切聲聞獨覺。
與諸如來平等平等。由法身故說有差別。
如來法身有差別故。無量功德最勝差別。
算數譬喻所不能及。
...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관>으로 개인의 해탈에 안주하고 중생제도를 외면함
생사현실이 곧 니르바나다.
수행자가 이런 사정을 관하여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한다.
그로 인해 그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생사 묶임에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경우 수행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생사현실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 그런 상태로 마냥 안주하고 임하게 되기 쉽다.
그런 가운데 <생사 즉 열반>을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중생이 고통을 겪는 상황마저도 그런 사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다른 중생제도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기 쉽다.
그런데 생사현실에서 다른 생명들은 여전히 그런 사정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망상분별과 집착을 갖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아 나간다.
현실에는 이처럼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수행자는 자신이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생명들이 고통을 제거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끝내 이런 망상분별과 집착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경전에 무진등(無盡燈)의 내용이 있다.
( 『유마힐소설경』 K0119 T0475 4. 보살품菩薩品)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불을 켠다고 하자.
그런 경우 자신의 등불은 그로 인해 줄지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등불을 켤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우 자신의 등불이 바람에 불어 꺼진다.
그래도 다른 등불로 인해 쉽게 다시 켜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등불만 홀로 밝은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집착이 없으면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악취공견)
모든 생멸현실의 본바탕은 모두 차별 없이 공하다.
따라서 본래 생멸과 생사고통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 니르바나다.
선악의 차별도 본래 없다.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일체가 다 니르바나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관한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깨닫는다.
그리고 망상분별과 집착을 버린다.
현실 일체의 본바탕은 모두 차별 없이 공하다.
그러나 현실 일체는 차별이 무량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상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가운데 가장 좋고 좋은 상태를 성취해가야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신도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수행에 정진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벗어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평안히 임한다.
그리고 다른 중생도 제도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벗어나게 한다.
그런 방향으로 수행에 정진해갈 수 있다.
이는 선취공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처럼 잘못 방향을 취할 수도 있다.
현실 일체는 차별이 무량하다.
그런데 그 본바탕이 차별 없이 공하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임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현실에서 아무렇게 행해도 무방하다고 잘못 여긴다.
심지어 현실에서 심하게 악행을 행해도 무방하다고 잘못 여긴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서 망집을 제거하는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이는 악취공견이다.
즉 공함을 바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세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악취공견을 취하고 고집한다.
그래서 평소 탐욕을 그대로 갖고 추구한다.
그리고 분노를 그대로 갖고 다른 중생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그 결과로 심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그런데 각 개인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
수행과 깨달음이 부족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실재가 차별 없이 공함을 배운다.
그런 경우 우선 실재의 공함을 관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현실에서 실재의 공함을 관하는 취지가 있다.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생사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의 본바탕인 실재를 관한다.
그래서 실재가 공함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현실은 실재를 바탕으로 얻는다.
그런데 그 현실은 매순간 생생하고 명료하게 얻는다.
그러나 그 본바탕은 실재는 공하여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은 침대에서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이를 통해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통해 집착을 제거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해 행하던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업장을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 등에 임한다.
그런데 이런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에 임하는 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망집에 묶이게 된다. [구생기신견, 변견, 탐,만,진,의 등 수혹]
그래서 생에 임하는 이상, 감각과 느낌 정서 의지적 번뇌를 계속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 망집번뇌에 바탕해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기 쉽다.
그런 경우 수행 노력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 평안히 참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 이런 수행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그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본바탕이 공하여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한편, 생사현실에서 본바탕의 측면을 취해 임한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의 상태로 여여하게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통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래야 중생제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행과정에서 역시 심한 생사고통에 처하기 쉽다.
그런 경우에도 생사현실이 본바탕이 공하여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또 생사현실에서 본바탕의 측면을 취해 임한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의 상태로 여여하게 임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의 심한 고통에 처해서도 평안하게 임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해 무량행문을 닦아 나간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본바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본래 실재 본바탕에서는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사정으로 실재 진여는 생사고통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한편 실재는 공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본래 공하다.
또한 실재가 실재를 아는 일도 얻을 수 없다.
실재는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이런 실재를 깨달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실재가 공한 사정을 이해한다고 수행자가 실재를 증득해 얻게 되는 일도 없다.
또 그로 인해 실재가 비로소 공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하거나 않거나 본래부터 본바탕은 공하다.
그리고 이미 모든 중생이 그런 본 바탕 실재를 떠난 적도 없다.
그래서 이미 그런 본 바탕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일으키거나 않거나 본바탕은 차별이 없다.
또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하거나 않거나 역시 본바탕은 차별이 없다.
또 그로 인해 생사고통을 겪거나 겪지 않거나 본바탕은 차별이 없다.
그 어느 경우에도 실재 진여에서는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실재 진여는 본래 생사고통을 떠난 니르바나다.
그러나 이 각 경우 문제는 생사현실이다.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일으킨다.
이런 현실의 본바탕은 차별 없이 공하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본래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러나 망집 상태에서는 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망집을 일으켜 현실을 대단히 실답게 여기게 된다.
현실은 꿈과 성격이 같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꿈이 아니다.
그리고 꿈과 다르다.
그리고 현실내용은 이를 대단히 실답게 여기게 하는 요소가 많다.
(참고 ▣- 현실을 진짜이며 실답다고 여기는 자세의 문제)
그래서 현실 내용에 집착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러면 이처럼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는다.
현실은 본래 니르바나다.
그래서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망집을 일으켜 임한다.
그런 경우 그처럼 본래 얻지 못하는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본래 현실은 꿈과 성격이 같다.
그러나 꿈처럼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꿈에서 악몽을 꾼다.
그런 경우 꿈을 그냥 깨어난다.
그러면 이로 인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꿈은 그래서 꿈인 이상 그냥 방치해도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생사현실에서 겪는 고통은 사정이 다르다.
생사현실을 벗어난다.
그래도 그 상태에서 실재를 직접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와 생사현실과 비교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근본정신은 계속 다음 생을 이어나가게 된다.
즉 업장과 번뇌에 묶여 다음 생을 계속 이어간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망집에 바탕해 임하게 된다.
결국 이런 근본정신의 구조와 기제는 세세생생 망집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생사고통은 현실을 실답게 여기는 망집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런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매순간 실답게 여기며 받아간다.
따라서 이런 생사고통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런 망집의 정도에 비례해 수행노력이 필요하다.
생사현실은 본래 꿈처럼 실답지 않다.
그러나 꿈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단지 실답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생사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적극적으로 수행노력을 통해 노력해 벗어나야 한다.
그런 경우 이런 망집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본바탕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본바탕이 공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본바탕에서 현실내용을 얻을 수 없음을 생사현실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행하는 업을 중지하고 끊어야 한다.
이런 사정으로 실재의 공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사 즉 열반>임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생사현실 안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물론 실재 진여에서는 그 어느 경우나 본래 차별이 없다.
즉, 그런 사정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본바탕은 차별이 없다.
그렇지만, 깨달음은 '생사현실 안에서' 그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생사현실에서 생사현실이 공하여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겪던 생사고통을 벗어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시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수행자가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평안하게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쉽게 극복하게 된다.
따라서 '생사현실 안에서' 본바탕이 공함을 깨닫고 이해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사현실 안에서 차이가 크다.
이는 마치 꿈속에서 그것이 꿈임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꿈인 것을 이해하던 못하던 모두 꿈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꿈 안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꿈 안에서 마치 현실에서 꿈을 대하듯, 꿈을 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꿈이 심한 악몽인 경우 그 차이가 크다.
생사현실의 사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생사현실 안에서' 실재가 공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 안에서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생사현실에서 실재의 공함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그런데 수행과정에서 계를 비롯해 기본 수행덕목이 원만히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 평소 세속에서 가진 습관과 경향을 남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습관[훈습된 습기]에 바탕해 현실을 대한다.
그리고 기존의 습관[훈습된 습기]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실재의 공함을 배운다.
그런 경우 실재의 공함을 관하는 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함을 이해해도 그 취지와 달리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공함을 이해하고도, 오히려 망집에 바탕해 행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실재의 공함의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또 이해하더라도 불충분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공에 대하여 유무 가운데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갖는다.
일체가 차별 없이 공하다,
실재의 바탕에서 차별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선과 악도 본래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실재의 바탕에서는 같고 다름을 모두 떠난다.
그래서 이들 선악이 완전히 같다거나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공하여 <얻을 수 없음>을 아주 없음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공함은 오직 있지 않음(차별 없음 등)이라고 치우쳐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본바탕이 전혀 없지 않음(같지 않음 등)의 면을 보지 못한다.
한편 <차별을 얻을 수 없음>을 '완전히 동일함'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차별 없음>을 '하나임', '서로 일치해 같음'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리고 공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공한 실재에 바탕해 현실을 얻는다.
따라서 실재와 현실을 서로 떠나 있지 않다.
실재와 현실의 측면이 서로 맞닿아 있다.
그런 가운데 한 주체는 화합해 현실 내용을 마음에서 얻는다.
그런데 현실 내용이 곧 실재인 것으로 잘못 여긴다.
또는 실재영역에 현실 내용과 일치한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잘못 여긴다.
또는 실재 영역에 현실 내용과 유사하거나 비례하는 내용이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평소에 집착하던 내용을 그대로 고집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이런 차별 없이 공함이 이런 자세를 정당화해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 기존의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하던 경향이 더 심화된다.
그래서 현실에 함부로 제멋대로 임하려 하기 쉽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기 쉽다.
또는 실재 영역에는 아무 내용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순전히 마음 홀로 현실 내용을 변화시켜 낸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일체를 실답지 않다고 오로지 부정하는 경향도 갖는다.
그래서 수행을 포함해 일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래서 현실의 무량한 선법을 모두 내버리고 행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를 다 함께 악취 공견이라고 표현한다.
수행과정에서는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함을 이해해도 생에 임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현실의 생에 임하는 한 기본적으로 감각과 분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실의 작은 어려움도 그런 공함의 이해를 바탕으로 극복하지 못한다.
이의 극복에는 수행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수도, 수혹]
수행과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 그 상태는 더 심하다.
그런 경우 다시 잘못된 공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차별 없이 공함이 그런 상태를 정당하게 허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수행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망집에 바탕해 임하던 상태처럼 마음대로 행하기 쉽다.
그래서 업을 함부로 행한다.
그러면 이로 인해 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빨리 고통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심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이런 경우 이론만으로는 고통을 극복하기 힘들다.
공함의 이해만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평안히 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대로 그 고통을 모두 받게 된다.
그런 경우 이후 망상분별과 집착을 더욱 버리기 힘들게 된다.
한편 이런 공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망상분별과 집착을 버린다.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행한다.
그래서 그 자신만은 현실 어떤 상태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처해도 그만은 무방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 마음대로 멋대로 업을 행한다고 하자.
그래서 극심한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마저도 실상이 차별 없이 공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론적 이해만으로 쉽게 고통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도 그 자신만은 무방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자신에게 무익하다.
더욱이 그런 상태는 다른 중생의 제도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로 인해 고통과 악만 증가시키게 된다.
이런 점이 문제다.
따라서 수행자는 계를 비롯한 기본 수행덕목부터 원만히 갖춰야 한다.
그리고 공함을 이해해야 하는 근본취지부터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실재의 공함을 관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업을 중단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공함의 이해는 여기에 본 취지가 있다.
그런데 공함을 이해하여 오히려 망집을 유지하고 키워나간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매 경우 업을 행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차별 없이 공한 가운데 하필 극심한 생사고통을 받아나간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곤란하다.
『유가사지론』에서는 그래서 이 사정을 다음처럼 제시한다.
...
세존은 비밀한 뜻[密意]에 의하여 말씀하시되,
'차라리 한 종류의 나라는 소견[我見]을 일으키는 이와 같게 될지언정,
한 종류의 나쁘게 공을 취하는 이[惡取空者]와 같게 되지 말라'고 하셨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나라는 소견을 일으키는 이는 다만 알 바의 경계에 대해서만 헷갈린 것이다.
그러나 온갖 알 바의 경계는 비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쁜 길에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른 법을 구하여 괴로움에서 해탈하려 하는데도 헛되이 속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도 아니한다.
법에 대해서나 진리에 대해서 역시 잘 이룩한다.
그리고 모든 배울 곳에서도 느즈러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쁘게 공을 취하는 이는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해서도 헷갈린다.
그리고 온갖 알아야 할 경계 역시 비방한다.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쁜 길에 떨어진다.
그리고 다른 법을 구하거나 괴로움에서 해탈하려 하는 데서도 헛되이 속는다.
그리고 역시 머물러 있다.
그리고 법에 있어서나 진리에 있어서도 잘 이룩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배울 곳에서도 지극히 느즈러짐을 낸다.
이와 같이 실제 있는 일을 덜하고 줄이는 이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과 비나야에 대하여 심히 무너지게 한다.
무엇을 나쁘게 공을 취하는 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문이거나 바라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 또한 믿어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공도 믿어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나쁘게 공을 취하는 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공은 저 실로 없는 것이요,
여기서의 공은 실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리로 말미암아 공이라고 말한다.
만약 온갖 것이 도무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공이라고 하였겠는가.
역시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곧 말하여 공이라 함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나쁘게 공을 취하는 이라고 한다.
...
( 『유가사지론』 보살지菩薩地 지유가처持瑜伽處 진실의품眞實義品)
K0570V15P0771a06L;
世尊依彼密意說言。
寧如一類起我見者。不如一類惡取空者。
何以故。起我見者。唯於所知境界迷惑。
不謗一切所知境界。不由此因墮諸惡趣。
於他求法求苦解脫。不為虛誑不作稽留。
於法於諦亦能建立。於諸學處不生慢緩。
惡取空者亦於所知境界迷惑。
亦謗一切所知境界。由此因故墮諸惡趣。
於他求法求苦解脫。能為虛誑亦作稽留。
於法於諦不能建立。於諸學處極生慢緩。
如是損減實有事者。
於佛所說法毘奈耶甚為失壞。
云何名為惡取空者。謂有沙門或婆羅門。
由彼故空亦不信受。於此而空亦不信受。
如是名為惡取空者。何以故。
由彼故空彼實是無。於此而空此實是有。
由此道理可說為空。若說一切都無所有。
何處何者何故名空。亦不應言由此於此即說為空。
是故名為惡取空者。
...
여기서 악취공견을 갖느니, 차라리 내가 실답게 있다는 망상분별을 일으켜 임하는 것이 낫다고 제시한다.
그만큼 수행에 있어서 악취공견의 해악이 심하기 때문이다.
###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방안
각 주체는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한다.
즉, <생을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근본정신 영역과 관련해 <망집 번뇌>를 일으킨다. [구생기신견, 변견, 탐,만,진의]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다시 분별작용을 통해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분별기번뇌]
생사현실에서 한 주체는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외부 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생사윤회 고통>을 겪어 나간다.
이것이 <생사현실>의 상황이다.
그런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생사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있다.
그런데 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이것은 문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사고통을 받게 하는 <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보시를 행해서 쌓인 업장을 해소한다.
또한 계를 지키고 10선법을 닦아 하늘에 이른다.
그래서 3악도 <생사고통>에서 일단 벗어나야 한다.[시론, 계론, 천론, 10선법-인천교]
이후 <계, 정, 혜> 3학을 닦아 나간다.
그런 가운데 <근본 망집>을 제거해가야 한다.
그래서 <생사 묶임>에서 벗어난다.
이런 경우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회신멸지>의 <무여열반>을 향해 나아간다. [아라한, 연각]
그러나 그런 경우 <다른 중생>이 문제로 남는다.
중생은 <생사현실>에서 스스로 <생사묶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비>를 바탕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수행>을 닦아 나간다. [대승보살승]
그래서 이 부분부터 <각 입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즉, <생사현실 일체>를 부정하고 <회신멸지 무여열반>을 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하는가.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자가 <수행방향>에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한편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생에 임하는 한, <생사현실>에서 여전히 <감각>이나 <느낌> <분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생사고통>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수행>중에 물러나기 쉽다.
그리고 <생사현실> 자체를 피하기 쉽다.
그러면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이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 먼저 이치상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한다.
그래서 이치상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관한다.
다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 경우 <안락한 상태 >에서는 <다른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극심한 고통>에 처할 경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먼저 <생사 즉 열반>의 <이치>를 확고하게 잘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 어떠한 상태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고 심한 생사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평안>히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안인성취]
그런 경우 <생멸을 떠난 진여 실재>의 이치를 현실에 스스로 <실증해 인가>한 상태가 된다. [무생법인]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불퇴전위]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을 닦아 나간다.
그런데 <생사 즉 열반>의 <이론>을 불충분하게 이해한다.
<생사 즉 열반>은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니르바나>임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내용>만 따로 떼어 치우쳐 강조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 임해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이를 이미 앞에서 살폈다.
그래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간단히 <요약>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 그런데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제시한다.
그래서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다.
따라서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하다>고 잘못 여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생사현실>을 되는대로 내맡기는 자세다. [임운任運]
인간은 <망집>에 바탕해 인위적으로 행한다.
인간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가 오히려 <자연>에 가깝다.
그러나 다시 노력을 통해 일체 <조작>이나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방임>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무위자연]
그리고 <이런 자세>가 오히려 <생사 즉 열반>관에 합당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수행 노력>을 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려 한다.
이는 결국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 <생사현실>은 <망집>에 바탕해 전개된다. 그래서 본래 <문제 상태>다.
그런데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오로지 <생사현실>을 무조건 <긍정적 자세>로만 대하려 하기 쉽다.
현실에서 오로지 <좋은 부분>만 취한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안주한다.
그리고 이를 <생사 즉 열반>관의 <수행>으로 잘못 이해한다.
이는 <앞 항목>과 유사하다.
다만 이 보다 <조금 더 나아간 입장>이다.
망집에 바탕해 <좋고 나쁨>을 섞여 받게 된다.
그런데 앞 경우는 이들을 그대로 놓고 <방임>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좋음>만을 치우쳐 취해 임하는 자세다.
그리고 <나쁨>까지도 <좋게 >관하려 노력한다.
그런 경우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이 <방치>된다.
그리고 더 <악화>되기 쉽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 앞,경우와 달리 <수행>은 행한다.
그런데 <생사현실> 수행중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한다.
그런데 <생사현실 일체>가 다 차별없이 <니르바나>라고 제시한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망상분별>과 <집착>의 상태로 다시 물러나도 무방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물러난다.[퇴전]
<수행>은 행한다.
그러나 수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면 바로바로 쉽게 <포기>한다.
그래서 결국 <문제 상태>로 남게 된다.
-- 한편 <생사 즉 니르바나>다.
그런 입장에서 <생사현실>에서 고통에 처해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안인 수행>이 대단히 중요한 <수행덕목>이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일체 생사고통>에 오로지 <평안히 참는 것>만을 수행으로 잘못 여긴다.
그래서 <고행>수행으로 일관하려 하기 쉽다.
그러면 <수행>과 <중생제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생사현실>에서 오직 <니르바나>의 측면만 취한다.
그래서 <없음>에 지나치게 치우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소극적 자세>로만 임하려 하기 쉽다.
생사현실에 임해 <수행>을 행한다.
그런데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에서는 닦아야할 부분이 무량한다.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수행자가 개인적으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무량한 <방편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무량한 선법>을 닦아가야 한다.
그런데 오직 <없음>에만 치우친다.
그리고 <망집번뇌>와 <고통>을 <제거함>에만 치중한다.
이런 경우 <문제현상>이 된다.
-- 개인적으로 <수행>을 통해 망상분별 집착>을 떠난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니르바나>임을 관하고 수행한다.
이후 그 자신은 생사현실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생명>이 고통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를 <방치>한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기 쉽다.
수행자가 본래 생사현실에 임하는 것은 <중생제도>를 위해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생사고통>에 노출된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을 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한다.
그런 자세가 수행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생사현실>에 <평안>하게 임하게 된 후 정작 <중생의 생사고통>을 <외면>한다.
그러면 <문제>다.
-- <망집>을 떠난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본래 차별없이 <공>함을 관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잘못 여긴다.
그래도 어차피 <차별없이> 공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행막식>하기 쉽다. (악취공견)
어차피 차별없이 <공>하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수행자는 차별없이 공한 가운데 하필 늘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경우 그 <수행자 자신>부터 문제다.
그뿐 아니라 <중생제도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뒤 세 항목>은 서로 유사하다.
수행을 함에 오로지 <없음>에만 치우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나아가 <중생제도>를 외면한다.
그러면 더 <문제>다.
한편 더 나아가 생사현실에서 제멋대로 임해도 <무방하다>고 임한다.
이 경우 그 자신부터 <생사고통>에 노출된다.
그리고 <중생제도>도 행하기 힘들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 나열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하튼 <각 입장>별로 문제가 많다.
이론상으로는 <생사현실 일체>가 본래 모두 차별없이 <니르바나>다.
그래서 이 어느 경우마 다 문제가 없을 듯 하다.
그래서 <혼동>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 바탕 측면>을 취한 경우다.
<본 바탕 측면>에서는 어느 경우나 차별이 없이 <공>하다.
그리고 본래 <니르바나>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망집>을 일으킨다.
그러면 <생사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는 <차이>가 있게 된다.
여하튼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기본적으로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본래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하는 것이 요구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생사현실>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이해는 <생사현실> 안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사정>을 이해하든 못하든 <본 바탕>에서는 차별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생사현실>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사정을 깨닫고 이해함>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안인>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을 잘 해나가야 한다.
그런 경우 <생사 즉 열반>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문제현상>을 살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점>을 피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잘 성취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생사현실 내 <수행>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
즉 생사현실에 임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어떻게 <중생제도>를 해나가야 하는가.
결국 핵심은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남에 있다.
그래서 <수행자 자신>도 <생사고통>을 벗어나야 한다.
또 <다른 중생>도 <생사고통>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어떤 자세>가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결국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생사현실>안에서 <망집>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생사현실 안에서 <망집>에 집착해 머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생사현실 안에서 열반 즉 <니르바나>에도 집착해 머물지 않아야 한다.
수행자가 <생사>에 집착하면 범부 상태처럼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열반>에 집착하면, 생사고통을 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생사현실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생사나 열반 어느쪽으로 집착해 머물지 않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무주처열반]
그리고 수행자가 생사현실에서 취하는 이런 자세를 무주처열반이라고 칭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 즉 열반>의 2중적인 측면- 현실 긍정과 부정
<생사 즉 열반관>을 취한다고 하자.
이는 <생사현실>을 한편으로는 <부정>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생사현실>을 <긍정>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2중적인 측면>을 갖는다.
즉, 일반적으로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수행자는 이런 측면의 생사현실은 <부정>하고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한편 <중생제도>를 위해서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 안에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실을 <긍정>해 대한다.
그리고 그런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생사현실을 긍정하는 자세로 임하게 된다
언뜻 이 <2측면>은 서로 <반대>되고 <모순 관계>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런 <2측면>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각 주체는 <근본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망집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다.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임하되 그 자신부터 이런 <문제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망상분별>을 제거하고 임해야 한다.
그리고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임해야 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 자신부터 <생사 묶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의 생사현실>은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거>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런데 한편 이런 <수행>도 역시 <생사현실> 안에서 행하게 된다.
즉 망집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현실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이런 측면에서 <현실>을 대하게 된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경우 <이런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과정에서 겪는 <생사고통>을 평안히 받아들인다.
이 경우 생사현실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수행을 위해 대면하는 현실>을<긍정> 한다. 그래서 2중적인 측면을 갖는다.
한편, 보살 수행자는 <중생 제도>를 위해 스스로 <생사현실>에 들어가 임한다.
그래서 중생들이 처한 생사고통 <현실>에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 해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중생>들을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이런 수행 과정에서 <수행자>부터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수행자>부터 생사현실의 극심한 고통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생사 즉 열반>을 현실에서 증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수행과정에서 <생사현실 일체>를 <니르바나>로 관한다.
그리고 <이치>대로, 생사현실에서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수행한다.
그래서 <안인>수행을 성취한다.
그래서 극심한 <생사고통>도 평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사현실> 일체를 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긍정>은 그런 생사현실이 <실답게 있다고 인정하는 긍정>이 아니다.
오히려 생사현실을 <꿈처럼 실답지 않다>고 <부정>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을 위해 <그런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긍정은 이런 <2중적 입장>으로서 <긍정>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임한다.
그래서 <외관상> 현실을 <긍정>하는 형태로 보이는 것뿐이다.
즉 <현실이 실답게 있다> 라는 <망집>을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을 피하지 않고 대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의 <고통>도 평안히 받아들인다.
그런 가운데 <자비심>에 바탕해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일으킨다.
그래서 온 생명에 대해, 제한없고. 차별없이 최상의 상태로 이끌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해간다.
그래서 <보살 수행자>는 <생사>를 피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사현실>에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그리고 <무량행문>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선교방편>을 통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그래서 <보살 수행자>는 <중생이 세속에 임하는 형태>와는 <반대>로 주로 임한다.
즉, 생사현실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올바로 <분별>한다.
그런 가운데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다음 수행을 실천해간다.
1.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좋음>을 그들에게 <베푼다>. [보시]
2.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좋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쁨>을 가하지 않는다. [정계]
3. 다른 생명이 자신의 <좋음>을 침해하고 <나쁨>을 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에 대해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현실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평안>히 참는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버린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안인]
4. 있는 <악>은 키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없는 <악>은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없는 <선>은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있는 <선>은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꾸준히 행해 나간다. [정진]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계>의 수행덕목에 해당한다.
그런 바탕에서 생사현실 안에서 <십바라밀다>를 닦아 나간다.
즉, <보시-정계-안인-정진-정려-반야-방편-원-력-지>의 수행을 해나간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삼매> , <다라니>, <신통>을 갖춘다.
그래서 무량한 <방편지혜>를 닦아 나간다.
이처럼 보살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즐겁게> <잘 >성취해간다. [유희ㆍ신통ㆍ자재]
이런 수행을 행할 경우 <생사 즉 열반>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극심한 <생사고통>에 처해서도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처럼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수행자 <자신>과 <중생>의 입장을 각기 달리 해야 한다.
<보살 수행자>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입장에서 수행을 한다.
그러나 <일반 중생>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일반 중생은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래서 중생들은 그런 <망집>을 곧바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업>도 곧바로 중단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현실에서 <문제 상황>이다.
그래서 <보살 수행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긴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관하면 본래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중생은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는다.
<수행자> 입장에서 이런 <중생의 상태>는 <올바른 상태>가 마땅히 아니다.
그래서 이를 <문제>로 여긴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켜 대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중생이 <악행>을 심하게 행한다.
그런 경우 7분노>를 일으키기 쉽다.
그런데 그런 경우 <중생>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힘들게 된다.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이 경우 수행자자신부터 <탐욕>과 <분노>의 번뇌를 잘 제거해야 한다.
특히 <분노>를 잘 제거해야 한다.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할 경우 <탐욕>은 그래도 폐헤가 덜 하다.
그러나 <분노>는 중생제도에서 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는 중생에 대해 <자비>로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즉 중생이 일으키는 온갖 <문제 상황>에 평안히 임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사 즉 열반관>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는 <문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취지는 아니다.
<중생 제도>를 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너무 급하게 서둔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유치원> 교사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생은 막무가내다.
유치원생은 덧셈도 모른다. 그리고 윤리도 잘 모른다.
아직 지식과 지혜가 짧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리고 자신만 고집한다.
그리고 다른 유치원생과 다툰다.
그리고 소란을 피운다.
이 <유치원생>은 지식과 교양을 익혀 나가야 한다.
하나하나 지식, 인격, 덕성, 체력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성인처럼 인격을 갖추고 점잖게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수십 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가 급하게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
유치원 7교사>는 일단 유치원생과 <눈높이>를 같이 해 임해야 한다.
그렇다고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생과 똑같이 되려는 취지는 아니다.
유치원생을 교육시켜 성인처럼 되게 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다양한 <방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일단 유치원생의 심정에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유치원생과 즐겁게 놀아준다.
그런 가운데 산수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친다.
그런 식으로 유치원생을 점차 <°개발>시켜야 한다.
<보살 수행자>의 <중생제도> 과정도 사정이 이와 같다.
수행자가 중생제도를 위해 <현실>에 임한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급하게 임한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서둔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실에서 <수행자>가 중생 상태에 맞추어 임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무량한 <방편>을 닦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점차 중생을 <제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수행자가 오히려 참아야 할 상황이 많다.
중생이 현실에서 심한 <악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사현실은 문제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하는 중생도 문제다.
그러나 <방편>>상 이 생사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히 참고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해 무량한 <방편>을 닦는다.
그런 가운데 점차 <선교방편>을 취해 중생을 <제도>해나가야 한다.
그런 경우 <생사 즉 열반관>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생사 즉 열반관>의 효용이 크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못마땅한 중생의 생사현실을 <방편>상 잠시 그대로 둔다.
그러나 한편 <보살 수행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
자신은 유치원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망집>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겪는 <일체 고통>을 <평안>히 참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중생>은 <망집>에 바탕해 이런 경우 잘 참지 못한다.
그래도 <자신>은 다시 이런 중생을 상대해 잘 참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 자신>은 중생에 대해서도 <상>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자 자신>이 7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가운데 또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 두 명제는 언뜻 자체 <모순적>이다.
서로 <상충>해 보인다.
중생에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도할 <중생>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제도>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면 또 중생에 대해 <상>을 취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이는 <열반 즉 생사>와 <생사 즉 열반>의 문제와 같다.
본래 생사현실에서 그런 <중생> 자체를 얻을 수 없다.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다.
그런데 <중생>들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본래 <니르바나>임에도 , 중생들은 <망집>에 바탕해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중생들이 스스로 <그 사정>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벗어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보살 수행자>가 실상을 잘 관한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워하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비심>을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생과 입장을 같이해 임한다.
그래서 중생이 일으킨 <망집상태>에 같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이 경우 <실상의 니르바나> 측면과 <현실 망집> 측면이 2중적이 된다.
이 경우 <양 측면>의 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실상의 측면>을 100% 취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한편 <망집에 바탕한 현실의 측면>을 100% 취한다.
그러면 자신부터 <생사고통>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이 <양 극단>을 피해야 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 과정에서 <중생제도>에 필요한 정도로 <현실의 측면>을 취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고통>에 노출된다.
그런 경우 <실상의 측면>을 취해 이를 평안히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잘 <극복>한다.
그래서 자신부터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상>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중생상>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생사현실>을 완전히 <외면>해 피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실상의 측면>을 99% 정도 취한다.
그리고 <현실 측면>을 1% 정도 취한다.
그런 측면에서 <2중적>이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제도>해간다.
만일 <수행자 자신>부터 <상>을 <취>한다고 하자.
그래서 자신부터 <집착>을 갖는다.
그러면 자신부터 <평안>히 참을 수 없다.
이런 경우 <그 자신>부터 문제다.
그리고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곤란하게 된다.
한편, 중생을 <제도>하고 변화시키기 측면도 사정이 같다.
지나치게 중생에 <집착>한다.
그래서 <상>을 취한다.
그러면 오히려 중생제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원만>히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중생제도를 원만히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중생에 대한 <상>을 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방편>을 취한다.
그래서 점차 <개선>하도록 임해야 한다.
이렇게 임해야 중생제도가 <원만>히 성취된다.
그래서 이 두 명제는 이런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경전에서는 다음 내용이 제시된다.
...
이렇게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이>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아상(我相)ㆍ인상(人相)ㆍ중생상(衆生相)ㆍ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
( 『금강반야바라밀경』 K0013)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
한편 <10 회향 >가운데 <구호일체중생 이중생상회향>(救護一切衆生 離衆生相廻向)이 있다.
이 표현도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 『대방광불화엄경』 제23권 25. 십회향품十廻向品)
한편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복덕과 지혜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또 <불국토>를 <장엄>해야 한다.
그리고 <법신>을 <증득>해야 한다.
그래서 <성불>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는 모두 <생사현실>내 <차별상>에서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현실의 측면>을 99 % 정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실상의 측면>을 1% 정도 취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무량한 선법>을 적극적으로 닦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실상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을 각 경우에 맞춰 < 2중적>으로 잘 임해야 한다.
그래서 각 경우 이런 수행의 <각기 다른 측면>이 <혼동>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현실부정적>인 측면 - <깨끗하지 못한 현실>의 부정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데 이 현실의 <본바탕>은 본래 <니르바나>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본래 그런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망집>에 바탕해 생사 현실에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생사현실은 <괴로운 생사 윤회과정>이 된다.
그런데 <본바탕>의 측면과 이 <생사 현실>의 측면은 서로 <2중적>이다.
그리고 서로 <모순적>이다.
현실은 같은 현실이다.
그런데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번뇌>와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생사고통>을 벗어나려 한다.
그런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실의 <정체>를 올바로 관해야 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집착을 가질만한 것>이 아님을 관한다.
일반적으로 <집착>을 갖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가족, 명예, 지위..등이다.
그래서 이런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일체 <색, 수, 상, 행, 식>는 <무상>하다.
그리고 일체는 <괴로움>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진짜로서 뼈대가 되는, 고정 불변한 <실체>가 없다.
[무아, 무자성, 무소유]
그리고 본바탕이 되는 <실재>는 한 주체가 직접 얻을수 없 다.
그래서 유무 등 일체 <분별>과 <언설>을 떠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공>하다고 표현하게 된다. [불가득, 공]
그래서 일체 현실의 이런 사정과 <정체>를 올바로 관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실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버린다.
경전에서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
탐욕을 떠나면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느니라.
…….
(『잡아함경』 0003, 무지경)
탐욕을 떠나 마음이 해탈한다면,
그는 태어남ㆍ늙음ㆍ병듦ㆍ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
(『잡아함경』 0004, 무지경2)
이런 측면을 우선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부처님은 <왕자의 신분>에서 현실 속에서 향락을 누린다.
그래서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왕이나 왕자의 상태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집착을 갖고 부러워한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 상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궁의 생활을 버린다.
그리고 <출가수행>에 나선다.
이런 수행은 세속적 현실을 <부정하는 측면>을 갖는다.
그런 사정으로 수행은 망집에 바탕한 <비관주의>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수행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수행은 망집에 바탕한 <생사고통>을 제거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수행을 <생사현실>에 임해 행한다.
<업을 중단하는 노력>도 생사현실 안에서 행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업장을 제거하는 수행>을 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해탈]
그런데 이 모든 수행은 <생사 현실> 안에서 행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니르바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측면은 망집에 바탕한 <비관주의>와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런 <차이>는 이미 살폈다.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참고 ▣- 비관주의와 불교의 차이)
여하튼 <수행>은 망집에 바탕해 임하는 <세속적 현실>을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측면은 모두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측면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끊고 버려야 할' 내용>을 버리는 수행이다.
그리고 이는 <본래의 니르바나의 상태>를 생사현실에서 회복함에 취지가 있다.
본 바탕은 본래 생사고통을 떠난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래서 이 부정은 <2중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측면을 부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니르바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수행을 행하는 현실을 긍정한다.
즉, <망집의 제거>는 본래의 니르바나 상태를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꿈>과 <현실>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꿈을 꾸면 <꿈 내용>만 얻는다.
그래서 <현실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꿈>을 깬다.
이 경우 <꿈>을 기준으로 하면 <꿈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현실 모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로 인해 침대가 놓인 <현실 모습>을 보게 된다.
다만 침대가 놓인 현실은 <본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꿈>을 깨어 <현실이 그처럼 얻어진다>고 여기게 되는 것 뿐이다.
<생사현실>의 상황도 이와 같다.
<실재>와 <현실>의 관계가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 <현실>과 <꿈>의 관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생사과정에서 한 주체는 <실재>를 직접 끝내 얻지 못한다.
그래서 단순히 <생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실재>를 파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재>와 <현실>을 대조해 살펴볼수도 없다.
또 이런 대조를 통해 곧바로 <현실>을 꿈처럼 <실답지 않다>고 파악하지는 못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
다만 생사 현실 안에서 <생사 고통>의 상태와 상대적으로 <실재>를 대비한다.
그래서 이런 <공한 실재>를 <청정>한 니르바나로 표현한다.
현실은 <망집>에 의해 <본래의 니르바나 상태>가 덮혀 가려진 상태다.
그런 가운데 실답지 않는 <생사고통>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의 <정체>를 깨닫는다.
그리고 <집착>을 버린다.
그러면 마음이 <망집>과 <생사의 묶임>에서 풀려나 벗어난다. [해탈]
그리고 본 바탕의 <청정>한 <니르바나>를 회복한다.
그런 경우 현실에서 곧 스스로 <해탈지견>을 증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전에서 다음 내용이 반복해 제시된다.
...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만일 스스로 증득하고자 하면
곧 스스로 증득할 수 있으니,
이른바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
(『잡아함경』 1 무상경)
♥Table of Contents
▣○ <현실긍정적>인 측면 - 깨끗한 형태로 현실의 <긍정>
현실의 <본 바탕 상태>는 본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니르바나> 상태다.
그러나 각 주체가 <근본 무명 어리석음>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망집>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는, 본래 <니르바나>임에도 <생사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이는 <열반 즉 생사>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현실>이 <꿈>과 같다.
<환영>과 같다.
<영화>나 <소설>과도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방향으로 관할 수 있다.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재물>을 뺏긴다.
그리고 <해침>을 당한다.
그런데 그로 인해 다치거나 해침을 당한 것이 아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다.
한편, 꿈 속에서 <황금>을 얻는다.
그렇다고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비유>를 놓고 현실을 다음처럼 이해해야 한다.
현실은 <꿈>과 같다.
→ <꿈>은 실답지 않다. 꾸며진 가짜다.
→ 마찬가지로 <현실>도 실답지 않다.
→ 그래서 이 모두에 <집착>을 버린다.
이런 방향을 취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는 <생사 즉 열반>의 입장과 같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음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꿈>은 현실과 성격이 같다.
→ 그런데 <현실>은 실답다.
→ 그래서 <꿈>도 또한 실답다.
→ 그래서 이 모두에 <집착>을 갖는다.
이런 방향으로 잘못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는 <열반 즉 생사>의 입장과 같다.
<현실>과 <실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현실에 이런 <두 측면>이 함께 갖춰져 있다.
현실에서 <망집>을 일으켜 임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이 <니르바나>임을 관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한다.
그리고 이를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 세계>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자신>과 <세계>가 그처럼 <실답게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들의 <생멸>도 그처럼 있다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 <탐욕>과 <집착>을 갖고 임한다.
그리고 망집의 바탕에서 <업>을 행한다.
그러면 각 주체와 <가해 피해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생사고통의 <윤회>를 겪어 나간다.
그래서 <생사고통>에 묶인다.
-- <생사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
이런 경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업>을 일단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망집>을 제거해간다.
<망집의 제거>는 본 바탕의 <니르바나>를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를 곧바로 떠나게 될 듯 하다.
그리고 곧바로 <니르바나> 상태를 회복할 듯 하다.
그러나 <생사현실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우선 기본적 수행 을 통해기존에 쌓아 놓은 <업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생사 묶임>에서 벗어남에 장애를 겪게 된다.
그래서 생사현실 안에서 <업의 장애를 제거하는 수행>을 통해, <업장>부터 남김없이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업장>을 제거해 3악도 <생사고통>의 묶임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한다.
그런 가운데 <망집> 제거를 위한 <수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선 <망집>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망집>의 제거자체가 쉽지 않다.
한편 <올바른 이치>를 관하여 <지적인 번뇌>를 제거한다고 하자.
그래서 <망집>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곧바로<생사현실>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즉 4성제 등을 관해 <망상분별> 즉 < 지적인 번뇌>(見惑견혹)를 제거한다고 하자.
그런데 <생래적 태생적 정서적 번뇌>(修惑수혹)들은 그것만으로곧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들 번뇌는 <생>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예를들어 배고픔이나 수면, 소대변 등에 대한 <생리적 욕구>는 <생>을 유지하는 한 계속된다. 또 신체를 통해 받게 되는 통증의 <감각> 등도 사정이 같다.
이는 <생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근본정신>과 <제7식>을 바탕으로 일으킨 번뇌에 바탕한다 . (구생기 신견, 변견)
그래서 <이런 번뇌>는 <지적인 번뇌>를 제거한 바탕에서 오랜 <수행>을 통해 끊어가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래적 태생적 정서적 번뇌>(修惑수혹)까지 온전히 제거해야 생사과정에서 생사 묶임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修道수도)
그리고 이를 위한 기본 수행에 <계ㆍ정ㆍ혜> 3학이 있다.
그리고 37도품(보리분법)의 수행을 닦아 나가게 된다.
이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과 같은 <8정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 수행을 모두 <현실> 안에서 실천해야 간다.
즉 이런 <수행> 자체도 <생사현실>에 임해 닦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수행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서도 수행자는 <생사현실>에 머물려야 한다.
-- <생사묶임>에 벗어나도 <생사현실>에 임하게 되는 사정
한편 수행자가 <생사 묶임>에서 풀려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다시 <생사현실>에 머물게 되는 사정이 있다.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벗어난다.
그런 가운데, 이후 <다음 생의 윤회생사>를 멸한다.
따라서 이후 <생>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 공한 <실재 진여>를 바탕으로 망집이 제거된 <근본정신>만 남는다.
그래서 <회신멸지의 상태>로 <니르바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관한다.
그래서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한다.
이는 마치 <꿈>을 꾸며, <꿈>이 <꿈>임을 이해하고 임하는 상태와 같다.
그런 경우 <현실>을 굳이 부정해 없앨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생사현실에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 머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고도 이후 <무여열반>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생사현실>에 남아 머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섭존자[Mahā-kāśyapa]와 빈두로[piṇḍola-bharadvāja] 존자 등의 경우와 같다.
한편 수행자 자신은 이런 수행노력으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다른 중생은 여전히 <생사고통>에 묶여 있다.
그리고 이런 중생은 스스로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른 중생을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제도하려는 서원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수행자는 중생이 임하는 <생사현실>에 같이 들어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임해야 한다.
그래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열반>에 끝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사현실>에 임하는 한 <생사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생사현실의 <생사고통>에 처해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사 즉 열반>인 사정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사현실>에서 여여하게 <니르바나> 상태로 임해야 한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생사 즉 열반>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의 <본 정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생사현실의 본 바탕에서는 본래 <생멸>이나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래 <니르바나> 상태다
그래서 <생사현실 일체>가 곧 <니르바나>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실에 임한다.
물론 <생사현실>을 이렇게 관찰하거나, 관찰하지 않거나, 본래 <니르바나> 상태다.
<본 바탕>에서는 이로 인해 <차별>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이해에 따라 <본 바탕 실재>에서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생사현실>에서 <차이>를 낳는다.
<깨달음>에 바탕해 임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사현실>에서 <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현실에서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리고 <번뇌>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고통스런 현실>에서도 평안하게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일체 고통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우는 굳이 <생사현실>을 지우고 떠나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
<생사 즉 열반>은 <이런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측면을 부정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을 실답지 않고 부정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고 긍정하는 2중적 측면을 갖는다.
그런 경우 설령 <지옥>에 처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이 아니다.
그 역시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것이 <지옥>이던 <극락>이던 모두 차별 없다.
그리고 평안히 <현실>에 머문다.
이는 극단적인 현실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경전에서 다음 내용을 제시한다.
…….
무간지옥에 나아가는 이도 긴 밤에 생사에 헤매는 것이 아니요
.
5무간지옥이 곧 보리요
…….
(『대반야바라밀다경』 제 574 권 만수실리본)
이는 <번뇌 즉 보리>라는 대승의 가르침과도 관련된다.
--- 오로지 버리기만 함과 <생사 즉 열반>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 일체는 부정하고 버려야 한다.
그런데 <수행>도 역시 <무상한 현실> 속에서 행한다.
그래서 역시 <괴로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수행도 <생사현실> 안에서임한다.
그래서 이런 <수행>도 역시 버려야 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수행>은 <망집>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망집에 가려진 <니르바나>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수행은 <망집 상태>에서 실천해 가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그런 수행을 통해 <생사현실>에서 <번뇌>와 <집착>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을 모두 끊고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사 즉 열반>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생사현실>에 '평안히 머물수 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현실 상황>에서도 평안히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이는 <망집>에 바탕한 <생사현실>을 부정한다.
이와 동시에 현실을 피하지 않는 <긍정적>측면을 갖는다.
그래서 <2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석존의 사례>를 통해 이런 측면을 살펴보자.
<석존>은 처음 왕궁에서 처자와 가족을 버리고 출가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을 한다.
수행 상황은 왕궁에 비해 열악하다.
<수행과정>에서는 세속적 욕구가 잘 성취되지 않는다.
그리고 낡은 옷과 구걸로서 삶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극악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도 <평안>하게 임한다.
그런 가운데 <수행>에 정진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속 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이다.
따라서 현실 <부정적> 측면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또 한편 수행을 위해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현실 상태>에서 평안하게 임한다.
이치럼 기본적으로 세속을 <부정>한다.
그러나 또 한편 <고통스런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2중적 측면>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석존>이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그 이후 <생사현실>에 그대로 임한다.
여기에는 <범천>의 권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후 <생사현실>에 임해 낡은 옷을 입고 생활한다.
그리고 <걸식>을 행한다.
이런 상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들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런 <힘든 현실상황>에 그처럼 계속 임한다.
그런 가운데 <제자>를 가르친다.
그리고 <중생제도>를 행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런 상태에서도 지극한 <안온함>과 <행복>을 얻는다고 강조한다.
경전에 다음 내용이 나온다.
<석존>이 <빈비사라왕>과 자신을 비교한다.
<빈비사라왕>은 왕으로 향락을 누리며 지낸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왕>보다 더 즐거움을 누린다고 설한다.
상식적으로 <현실의 왕>이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여긴다.
<왕>은 현실에서 향락과 권세를 누린다.
그런데 당시 <석존>은 낡은 옷을 입고 구걸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현실의 왕>이 석존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빈비사라왕>이 누리는 즐거움은 <한시적>인 즐거움이다.
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현실에서 <왕>이 누리는 즐거움이란 그와 같다.
즉, <제한된 조건>이 충족된 잠시간만 안락함을 누린다.
반면 <석존>이 느끼는 즐거움은 이와 다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부터 <안락함>을 얻고 누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생사현실 일체 나머지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 『증일아함경』 41. 막외품莫畏品)
기본적으로 <세속>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스런 생사현실>에서도 <평안>히 임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2중적 측면>으로 임한다.
<생사현실>이 청정한 진여 <니르바나>를 덮고 있다.
그런데 그 역시 본래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런데 술에 취하거나 눈병이 나서 <허공>에서 헛것을 본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곤란>을 겪는다.
그런데 이후 스스로 술에 취하고 <눈병>에 걸린 것을 자각한다.
그래서 <허공에 보이는 것>들이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런 경우 그런 <분별>은 <실재>에 상응한다.
<그런 상태>로 임한다.
그런 경우 여전히 <허공>에서 헛것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해 이후 <헛것>에 이끌려 <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래 있는 <니르바나>도 그로 인해 덮어 가리지 않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다.
♥Table of Contents
▣○ 윤리적 <이상>추구 실천행의 측면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2중적 측면>으로 임한다.
먼저 <망집>에 바탕해 얻는 생사현실을 <부정>한다.
그런 가운데 <깨달음>에 바탕해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을 <긍정>하며 임한다.
그래서 <망집>을 떠나 <생사현실>안에서 <생사 즉 열반>임을 관한다.
<생사 즉 열반>을 깨닫게 되는 계기에는 다음이 있다.
우선 수행자는 <현실>에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실상이 <공함>을 관한다.
그리고 <공한 실상의 측면>을 취한다. 그리고 그 측면으로, 현실을 대한다.
한편, 본바탕 실상이 공하다. 그래서, 생사현실은 꿈처럼 <실답지 않다>.
이런 사정을 잘 관한다. 그래서 생사현실을 <꿈>처럼 실답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집착>을 버리고 대한다.
한편, 현실 각 내용이 제각각 <요구되어지는 참된 성품>들을 <결 하고 있음>을 관한다.
즉, <본바탕 실재영역>에는 <참된 실체>가 없다. [勝義無自性승의무자성]
<감각현실>은 인과에 의존해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도 있다고 할 <실재의 내용>이 아니다. [生無自性생무자성]
한편 <관념 분별>에는 <그 관념이 가리키는 구체적 모습> [自相자상 ] 이 없다.[相無自性상무자성 ]
이런 사정으로 <이들 내용>이 하나같이 <실답지 않다>
이런 사정을 관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상(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고통스런 <생사현실>에서도 <평안>히 임한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생사현실>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임하면 <망상분별>로 일으키는 번뇌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생래적으로 갖게 되는 <감각적 정서적 번뇌>는 이것만으로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자는 욕계 생사 현실을 벗어나는 것도 곤란하다.
구제할 중생이 욕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색계 무색계 정려나 사마타 수행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권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욕계 생사 현실> 안에서 <집중>과 사마타 수행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는 비유하면, 화살을 뽑는 수술을 할때 관우가 바둑에 집중해 고통을 극복했다는 방식과 같다.
이는 삼매의 일반방식과 같다.
그러나 그것이 성문 수행과정에서 제시되는 <색계>, <무색계 정려 >방안이 아님에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욕계 생사현실>에서 당면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한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생사현실>을 <니르바나>로 관하여 단순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안주함>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보살 수행자는 그런 바탕에서 다시 <원대하고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보살은 다음 <서원>을 갖는다.
다른 생명을 <생사고통의 묶임>으로부터 <제도>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부터 <망집 번뇌>를 모두 끊는다.
그리고 <법문>을 익힌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한다.
그리고 <최상의 깨달음>(보리)을 증득한다.
그리고 <법신>을 증득하여 <성불>하고자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한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해탈>, <니르바나>, <보리>의 상태를 함께 성취하게 한다.
그리고 중생도 끝내 <위와 같은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을 원만하게 성취하고자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잘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구족 한다.
그래서 공한 <실재>에 상응하여 <집착>을 떠나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하여 <수행>에 임한다.
그런 바탕에서 <생사현실>에 임해 <수행>을 실천해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생사윤회>를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이상적인 방안>으로 추구하고 실천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행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생사현실의 <차별상>에서 얻는 내용들이다.
결국 하나의 수행이 <이런 다양한 측면의 성격>을 현실에서 동시에 갖는다.
우선 수행은 현실에서 일반 <세속입장>을 <부정>하는 측면을 갖는다. [현실부정적인 측면]
그러나 한편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극한 <생사고통>에 처해서도 <평안> 히 머문다. [현실긍정적인 측면]
그런데 또 그렇다고 단순히 <생사현실>에 <안주>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생사현실에서 <무량한 선법>을 추구하고 성취한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 실천한다. [이상 추구실천행의 측면]
대승에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은 <이런 성격>을 함께 갖는다.
그리고 이런 수행 역시 <현실>에서 행해 나간다.
이를 <비유>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이가 전자게임을 행한다.
그런 경우 전자게임 화면 내용이 하나하나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의 가치나 진실성을 부정하며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전자게임 화면 속 내용이 어떤 내용이더라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그런 가운데 <평안>히 전자게임을 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태라고 해서 <전자게임>을 아주 잘 해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게임에 의해 미혹당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런데 전자게임 안에서 다시 이에 임하는 다른 이를 위해 <전자게임>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다시 <전자게임>을 아주 잘 행하려 한다.
그래서 게임 안에서 수많은 <아이템>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게임 안에서 게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전자게임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머무는 상태>와 다르다.
석존의 중생제도의 경우도 사정이 같다.
석존이 중생제도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연다.[개開]
그래서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보인다. [示시]
그리고 중생들이 깨닫게 한다. [悟오]
그 깨달음에 들어오게 한다. [入입]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많은 설법을 행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보살 수행자도 이와 같다.
이들은 모두 이상추구 실천행의 성격을 갖는다.
즉, 생사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상적 상태>를 추구해 간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망집에 바탕해 행하는> <업>과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깨달음>에 바탕해 임하는가 여부에 있다.
결국 '<생사현실 안에서>' <깨달음>이 갖는 의미가 크다.
여기서 <생사현실 안의 깨달음>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유를 해보자.
독특한 맛을 가진 <차>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맛을 <언설>로 기술한다고 하자.
이 경우 언설로 이를 자세히 기술한다.
그렇다해도 그 <언설>이 <차맛>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언설을 통해 <차맛 >자체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는 생사현실에서 <본 바탕> 사정에 대한 <깨달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생사현실에서 <본 바탕>의 사정을 관한다.
<실재>에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주체가 끝내 <그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한다.
그러나 각 주체가 이처럼 <얻지 못함>은 그런 각 주체의 사정일 뿐이다.
그리고 <실재> 자체가 갖는 <성품>이라고 할 바는 아니다.
한편, <본 바탕>의 <그런 사정>은 깨달음을 얻거나 얻지못하거나 차별이 없다. [본각]
그 <본 바탕 실재>를 각 주체가 끝내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재의 상태>는 언설을 떠난다.
그리고 그런 <본 바탕의 상태>를 <언설>로 가리키고자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를 <공>이라고 표현하며 가리킨다.
여기서 <공>이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단지 위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기 위한 표현일 뿐이다.
그런 가운데 <실재>가 갖는 이런 사정을 <관념>과 <언설>로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경우 그 <관념 언설>이 곧 공한 <실재>인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런 <분별이나 언설>이 본 바탕 <실재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 언설로 본 바탕의 공한 상태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런 분별이나 안설로 실재의 상태를 막연하게나마 엇비슷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 뿐이다.
즉, 그 본 바탕 실재를 각 주체가 끝내 <얻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그렇지만, <생사현실>에서는 이런 <관념과 언설>이 갖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런 <언설>을 통해 <본 바탕 사정>을 이해함이 생사현실 안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즉, 이를 통해 <생사현실 안>에서 <망집>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해 <망집>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처럼 망집을 제거해서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방편상 언설로 표현된 내용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게 된다.
부처님의 입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경전 곳곳에서 나타난다.
경전에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느 밤에 큰 보리를 증득하였다.
어느 밤에 반열반(般涅槃)에 들것이다.
나는 그 중간에 한 자(字)도 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대혜여,
어떤 것이 자신이 안으로 증득하는 법에 의함인가?
저 과거의 여러 부처님·여래께서 증득하신 법이다.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더하지도 줄지도 않는 자신이 안으로 증득하는 모든 경계'를 증득한다.
그래서 언어(言語)로 분별하는 상을 떠난다.
그리고 두 가지 명자(名字)를 떠난다.
...
(『입능가경』 4. 불심품佛心品)
K0160V10P0867a06L;
...
我何等夜證大菩提,何等夜入般涅槃,
我於中間不說一字。佛言非言,
[...]
大慧!
云何依自身內證法?謂彼過去諸佛如來所證得法,
我亦如是證得不增不減,
自身內證諸境界行,離言語分別相離二種字故。
...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수많은 <설법>을 하신다.
이러한 사실은 중생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한 자(字)도 말하지 아니했다고 밝힌다.
그런데 <이 말씀자체>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 바가 없다고 설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경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생사현실 속에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평소 잘못된 <망상 분별>을 행한다.
그리고 <일정한 내용>을 취해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관념의 내용>(변계소집상)을 <감각현실>과 <실재>에 접착시킨다.
더 나아가 <이런 내용>이< 실재>한다고 잘못 여긴다.
또 이들이 영원불변한 참된 <진짜의 내용>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실답게 있다>고 잘못 여긴다.
그런 바탕에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러면 이로 인해 그런 바탕에서 <생사고통>을 겪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번뇌와 집착을 버리는 수행>(심해탈, 번뇌장의 제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지적 깨달음>(혜해탈, 소지장의 제거)이 필요하다.
즉 현실의 <정체>에 대해 올바로 관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자는 <생사현실>을 다음처럼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
현실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수행자는 <분별판단>이 <망상분별>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체의 <분별판단>은 <관념>(변계소집상)에 바탕한다.
그런데 이는 <실재>나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실답지 않다>.
그래서 본질적으로<희론>(戱論)이다.
여기서 희론은 <관념영역>에서만 통용되는, 실없는 말장난 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관념>으로 <차맛>을 분별한다.
그리고 이를 <언설>로 기술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혀로 맛보는 차맛>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실재는 본래 <언설 분별>을 떠난다.
그래서 실재에 대한 <분별>도 이와 사정이 같다.
그래서 <언설 분별>은 기본적으로 희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견해>를 떠나고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수행자가 <중생 제도>를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중생과 <눈높이>를 같이 하여 임한다.
이런 경우 수행자도 생사현실에서 <분별>을 행하게 된다.
그런 경우 <이들 분별>도 기본적으로 중생이 행하는 <분별>과 성격이 같다.
다만, 수행자는 그것이 본래 <희론>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망상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 그런 망집에 바탕해 <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한 <실재>에 상응하여 임한다.
다만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중생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언설 방편>을 취한다.
그래서 본래 희론인 <분별>과 <언어>에 의존해 설법을 한다.
그래서 중생들이 <그런 사정>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망집>을 제거하게 한다.
그런 <효용>을 갖는다.
그러나 그런 설법은 본<래 희론>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다만 그런 <희론>과 <망집>을 <제거>하는 희론이 된다.
그래서 다음처럼 설법하게 된다.
이들에 <참된 진짜>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 무자성>이다.
또 본 바탕 <실재>는 <공>하다.
그래서 현실 내용이 <무아, 무자성, 공>이라고 설한다.
그리고 본래 <생사 생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본래 실답지 않다.
따라서 <꿈>이나 <환영>과 같다고 설한다.
그런데 <이런 설법> 자체 역시 그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 <본 바탕 실재>는 사실 <이런 언설> 자체를 모두 떠나는 것이다.
경전에 다음 내용이 나온다.
...
선현아,
네가 말하기를 만일 온갖 법이 모두가 제 성품이 공할진대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
만일 배울 곳이 있다면
세존은 희론(戱論)이 없는 곳에서 희론을 말하되
모든 법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까닭이다, 이 때문이다,
내지 여래의 법이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였거니와,
만일 모든 생명(유정)들이
온갖 법의 제 성품이 모두 공한 것을 '알면'
모든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을 배워서 일체지지를 증득하여
모든 생명들을 위해 건립하고 연설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모든 생명이
모든 법의 제 성품이 모두 공한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보살마하살은 결정코 온갖 법을 배워서
일체지지를 증득하여
모든 생명들을 위해 건립하고 연설하여야 하느니라.
...
(『대반야바라밀다경』 도토품)
K0001V04P0210c03L;
...
是故菩薩摩訶薩能證無上正等菩提。善現!如汝所言『若一切法皆自性空,
云何菩薩摩訶薩於何處學?若有所學,
將無世尊於無戲論而作戲論,謂有諸法是此、
是彼,由是、為是,廣說乃至是如來法?』者,善現!
若諸有情知一切法皆自性空,
則諸菩薩摩訶薩不應學一切法,證得一切智智,
為諸有情建立宣說。以諸有情不知諸法皆自性空故,
諸菩薩摩訶薩定應學一切法,
證得一切智智,為諸有情建立宣說。
...
또 경전에 다음 내용이 나온다.
...
“이른바 성인이 성인의 소견을 알고
성인의 지혜로 성인의 지견(智見)을 아니,
증득한 바를 말할 수 없건만
그 언어가 없는 법을 말씀하려 하여
형상에 의지하여 저러한 유위ㆍ무위를 말씀합니다.
...
(『심밀해탈경』 2. 성자선문보살문품聖者善問菩薩問品)
K0153V10P0674a08L;
...
所謂聖人知聖人見。聖智知聖見見。無言所證。
為欲說彼無言語法。依相說彼有為無為。
...
일반적으로 <생사현실>에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임한다.
즉, <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생명에 대한 생각>, <목숨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바탕해 현실에서 <일정 부분>에 상을 취한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 임한다.
그리고 <업>을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그러나 보살 수행자는 이런 <상>을 현실에서 취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와 <성불>의 서원을 실천해간다.
♥Table of Contents
▣-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과 생사윤회 [변역생사]
보살이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실천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보살은 <일반 중생>과 같은 상황에 노출된다.
<실재>를 바탕으로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에서 <감각현실>을 얻는다.
그리고 <관념>도 얻게 된다.
한편, 일반 생명이 <병>에 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가운데 일반 생명이 그로 인해 <번뇌>와 <고통>을 얻는다.
그리고 고통의 <생사윤회>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보살>도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보살도 이런 <생로병사>에 같이 노출된다.
그러나 보살은 그로 인해 <번뇌>와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보살은 보살의 자비의 <서원>에 의해 생사현실에 들어간다.
즉, <변역생사>(變易生死)를 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이런 차이는 현실에서 <망상분별>을 제거함에 있다.
<분별>과 <집착>을 버린다.
그 상태에서 <생사>에 그대로 머문다.
그러나 <번뇌>와 <고통>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중생제도>와 <성불>을 목표로 수행을 계속 행할 수 있다.
한편 <생사현실> 속에서 다른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에서 이들을 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광대무변한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실천해나간다.
그리고 바라밀행을 실천해간다.
즉, <보시-정계-안인-정진-정려-반야-방편-원-력-지>의 바라밀행을 실천해간다.
그리고 온갖 생명이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생사를 피하지 않는다.
이런 수행자는 생사현실에서 <생사윤회>하며 <수행>을 해나가게 된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현실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
이는 마치 <연꽃>과 같다.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런 상황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내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친다.
그런데 중생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다.
따라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준다.
그리고 중생을 끝내 <깨달음>(보리)을 얻게 한다.
그래서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불의 상태>로 이끌고자 한다.
이 경우 종국적으로 <생사고통>을 제거함이 기본적이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성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일단 어느 상황에서나 먼저 실천할 방안이 있다.
그것은 모든 수행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취할 <수행>이다.
그래서 이런 기본 수행부터 잘 실천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서원>을 세운다.
이는 각 부처님의 서원의 <구체적 내용>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이나 약사유리광여래, 보견여래, 보광상다공덕해왕여래.... 등이 다 다르다.
그 외 무수한 여래의 상태도 그와 같다.
어떤 수행자는 온 생명을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끝없이 중생구제의 행을 실천해나가는 경우도 있다.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다.
그래서 무한한 기간에 걸쳐 중생을 구제한다.
그리고 중생들의 제도와 성불을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법장비구는 왕위를 버리고< 48 대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수행에 정진한다.
그리고 끝내 극락정토를 만든다.
그리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시킨다.
그래서 각 수행자들이 불퇴전위를 이루고 끝내 성불하도록 이끈다.
한편 문수사리보살은 수행을 통하여 보견여래가 된다.
한편 이미 그런 상태를 성취한 보광상다공덕해왕((普光常多功德海王)여래도 계신다.
경전에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
그때 대중 속에 있던 모든 보살이 생각하기를
‘문수사리가 얻게 될 부처님 세계의 공덕과 장엄은 아미타불의 세계와 같은 것일까’라고 하였다.
그때 세존은 그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을 아시고 곧 사자용맹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한 개의 털을 100개로 쪼갠 뒤에
그 쪼개진 한 개의 털을 큰 바닷물 속에 넣어서 한 방울의 물을 적셔냈다면
이 한 방울의 물을 아미타불세계의 장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그 큰 바다의 물을 보견 여래의 부처님세계의 장엄에다 비유할 수 있나니, 다시 그보다 더 뛰어나느니라.
왜냐 하면 보견 여래의 부처님세계의 장엄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니라.”
그 때 사자용맹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종류의 부처님세계의 장엄은 3세(世)의 부처님 세계의 장엄에도 혹시 또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느니라. 선남자야, 동방으로 여기서 백억의 항하강 모래만큼 많은 세계를 지나서
주최상원(住最上願)이라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그 속에 부처님이 계신데 명호는 보광상다공덕해왕(普光常多功德海王)이시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항상 보살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고 계시느니라.
...
(『대보적경』 제 60 권)
이처럼 정토는 공덕이 장엄하다.
그런 경우 질병의 고통은 적다.
그 수명은 무량하다.
또 불국토의 장엄은 한없이 뛰어나다.
그래서 중생은 이런 상태에서 수행을 보다 쉽게 성취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여래는 공통적으로 법신을 증득해 성불한다.
따라서 법신의 중득은 수행자가 성취할 기본 목표가 된다.
그런 가운데 수행자는 이런 무량수불(아미타불)처럼 되는 서원을 가질 수 있다.
또는 약사유리광여래처럼 되는 서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각각 이러한 서원의 성취를 위해 수행 정진해 나간다.
수행자는 아직 서원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런 경우 부처님이 그 수행을 도와준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미리 뜻을 작게 갖거나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광대무변한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낫다.
무상한 현실에는 과거의 <좋음>과 <나쁨>이 뒤섞여 있다.
그런 가운데 <서원>을 위해 수행한다.
이 역시 세속에서 좋음을 추구하는 행위와 외관은 같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망상분별>과 <집착>에 바탕한다.
그런 경우 생사 윤회의 <고통>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두 상태는 서로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서원의 실천이 갖는 <가치>가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역시 <집착>을 벗어나 행해 나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Table of Contents
▣- 무상한 현실 내 수행의 의미 - 현실 부정과 현실 긍정과 이상추구
이상적 <수행의 목표>와 <무상, 고>의 관계를 먼저 살폈다.
다시 이를 정리해보자.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런 경우 망집에 바탕한 <일체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無常무상]
그리고 <생사고통>에 귀결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생사현실 일체>가 문제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해탈>과 <니르바나>의 상태는 이런 <생멸> 현상과 <고통>을 떠난 것이다.
따라서 수행 <목표> 상태가 된다.
그런데 한편 생사현실의 <본 바탕>은 본래 <생멸>과 <고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래 <니르바나> 즉 <열반>의 상태다.
이는 <일체 현상>을 놓고 서로 <모순>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바탕으로 임한다.
그러면 그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겪는다.
한편, 이런 <망상분별>을 떠나 <깨달음>으로 대한다고 하자.
그러면 본래 그런 <생사고통>을 얻을 수 없음을 관하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처럼 <망집>에 바탕한 <현실의 일체>가 영원하지 않다. [無常무상]
괴로움이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망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사 고통>을 멸해 없앤다.
그러면, 생사고통을 떠난 <니르바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수행>은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생사현실> 안에서 <수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수행>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다음 성격을 갖게 된다.
즉, 우선, <망집>에 바탕한 현실은 이를 <부정>하고 제거하는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수행자는 중생제도를 위해 중생이 처해 있는 <생사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사 현실>을 평안히 참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사 현실> 안에서 수행을 성취한다.
그래서 수행은 이런 <현실 긍정적>측면 이 있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중생제도>와 <성불>을 위해 <광대무변한 서원>을 세운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적 상태>를 무량하게 성취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수행>이 <현실>과 갖는 <관계성>을 이처럼 나누어 살폈다.
*pt* 끝 to k0020sf-- ♠일반의 경우와 불교의 목표의 차이
*pt* 끝 to k0650sf-- ♠무상과 고의 관계성
♥Table of Contents
▣- 공, 비아와 수행목표의 관계
한편, 이제 <공>과 <비아, 무아, 무자성>의 판단과의 관계를 살피기로 하자.
<생사현실> 은 영단하지 않아 , <무상>하고 <고통>의 상태다.
이에 반해 <열반>은 <생멸>과 <고통>을 떠나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과 <열반>사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 <무아, 무자성>의 경우는 <무상> <고>의 경우와는 다르다.
<번뇌>의 상태도 그 실재는 <공>하고 <무아ㆍ무자성>이다.
번뇌에 바탕해 <업>을 행한다. 그 경우도 그 실재는 <공>하고 <무아ㆍ무자성>이다.
생사현실에서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도 그 실재는 <공>하고 <무아ㆍ무자성>이다.
망집을 제거를 위해 <수행>을 행한다. 그래도 그 실재는 <공>, <무아ㆍ무자성>이다.
그리고 보리[깨달음]을 얻어 번뇌를 벗어난다. 그 경우도 그 실재는 <공>하고 <무아ㆍ무자성>이다.
그리고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는다. 그런 경우도 역시 그 실재는 <공>하고 <무아ㆍ무자성>이다.
생사현실과 열반은 다 함께 그 실재는 <공>하고, <무아, 무자성>이다.
이런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공>은 <실재>의 측면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무아, 무자성>은 참된 진짜로서의 <영원불변한 본체>에 대한 판단이다.
<실상>이 <공>하지 않은 <다른 상태>가 있지 않다.
또 <무아ㆍ무자성>이 아닌 <다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상태>가 수행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수행>은 이런 <공, 무아, 무자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과 <무아, 무자성>과 관련해 <수행>을 살피는 것이다.
어차피 어느 경우나 <공, 무아, 무자성>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사정을 깨닫는다.
그러면 이는 <현실>에서 <차이>를 낳는다.
어차피 일체가 <공, 무아, 무자성>이다.
>그런데 <망집>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사현실에 임해 <생사고통>을 겪어 나간다.
그러나 <생사현실>에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래서 일체가 <본래 무아, 무자성, 공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의 상태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를 통해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깨달음>은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차이>를 낳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실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 것>과 <수행을 함>은 차이가 크다.
이를 아래에 이어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생사현실>에서 <공>의 이해가 갖는 <효용>과 <본바탕>의 관계
<생사현실>과 <생사고통>이 모두 참된 진짜 <실체>가 아니다.
번뇌나, 고통의 상태도 그 본바탕은 역시 <공>하고 <무아ㆍ무자성>이다.
한편 <공>한 가운데에는 <생멸>과 <더러움>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사리불이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不生] 없어지지도 않으며[不滅]
더럽지도 않고[不垢] 깨끗하지도 않으며[不淨]
늘지도 않고[不增] 줄지도 않느니라[不減].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 수, 상, 행, 식이 없으며, ...
(『반야바라밀다심경』 K0020)
K0020V05P1035a06L;
...
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
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
...
한편, <공>과 <무아ㆍ무자성>이란, <본래가 그러함>을 의미한다.
어떤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상태가 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수행>으로 현실이 <무아, 무자성의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 자체는 <어떤 상태>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수행>은 노력하여 새로 <공한 상태>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수행>은 <공하지 않은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아ㆍ무자성>이 아닌 어떤 상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공>을 <깨달음>으로 인해 <공, 무아, 무자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본래의 니르바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과 무아ㆍ무자성> 자체가 그것만으로 곧바로 수행 목표는 아니다.
<번뇌인 상태>나 <번뇌를 제거한 상태>나 모두 다 <공, 무아, 무자성>이다.
또 현실에서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망집>을 제거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 <업>을 행하거나 <업>을 행하지 않거나 모두 다 <공, 무아, 무자성>이다.
<생사고통>을 받는 상태도 <공, 무아, 무자성>이다.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 무아, 무자성>이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벗어난 상태>도 역시 <공, 무아, 무자성>이다.
모든 경우가 다 함께 <공, 무아,무자성>이다.
그래서 본래 <있음과 없음>을 떠난다.
그 어느 경우나 <본바탕>이 <니르바나의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생사현실 >안에서 <이런 사정>을 깨닫는다.
그런 경우 <이런 깨달음>은 <생사 현실> 속에서 <차이>를 낳는다.
일체가 모두 다 <공>하여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본래의 상태>는 일체가 모두 <청정>한 니르바나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집>에 바탕해 임한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서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이 가운데 <일부>를 취해 <자신>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자신의 <망상 분별>에 갇힌다.
그리고 <업>(뜻, 말, 글, 행위, 태도)을 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상태에 처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하나같이 <공하고 무아ㆍ무자성>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런 바탕에서 <생사 현실> 안에서 <생사고통>을 겪는 것이 문제다.
즉 어떤 이가 <망집>에 바탕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경우 생사현실에서 <본래 얻을 수 없는> <생사고통>을 <실답게> 받아나가게 된다.
이는 <문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현실 안에서' <깨닫는다>.
즉, 일체가 본래 <무아, 무자성, 공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생사현실이 <본래 니르바나의 상태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생사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는 <생사현실> 안에서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생사현실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 것>과 <수행을 함>은 차이가 크다.
<수행>을 행한다.
그래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생사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행의 목표는 1차적으로 이런 <생사고통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사윤회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의 상태를 얻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래서 고통을 떠난 <열반>의 상태를 성취한다.
한편 이런 경우 <생사 즉 열반>임을 깨닫는다.
그런 경우 다시 '<생사현실> 안에서도 그대로 <여여>하게 <니르바나의 상태>로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사현실>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다.
이는 <다음의 경우>와 같다.
<꿈>을 꾼다. 그런데 그로 인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꿈>에서 악몽을 꾸나 좋은 꿈을 꾸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꿈> 안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처음에는 <꿈을 깨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후 <꿈> 안에서 그것이 <꿈>임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면 <꿈>에서 어느 경우나 <평안>히 임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다.
<실재>가 <공>한 가운데 이처럼 생사현실에 <차별>이 나타난다.
즉, <망집에 바탕해 임하는 것>과 <깨달음에 바탕해 임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현실> 안에서 본 바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의 의미가 크다.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여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 모두 공함을 관하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나 건너느니라
...
(『반야바라밀다심경』 K0020)
K0020V05P1035a03L;
...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
...
<공>함을 관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나는 방안이 되는가.
처음 <망집>에 바탕해 일반적으로 <유>[有]에 치우친 견해를 가진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신>이나 <세상 내용>이 <실답게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망상 분별>과 <집착>에 바탕해 <업>을 행하고, 그결과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먼저 <실재가 공함>을 잘 관한다.
그런데 생사현실은 이런 <공한 실재>에 바탕해 얻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생사현실이 <꿈>처럼 <실답지 않음>을 관한다.
현실은 마치 침대에 누워 꾸는 바다 <꿈>과 <성격>이 같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망상 분별>과 <집착>을 떠난다.
그래서 <망상분별에 바탕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편, 실재가 <공>한 가운데 현상의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공한 실재의 측면>을 취한다.
그런 가운데 <공한 실재의 측면>으로 현실을 대한다.
그래서 일체의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나 건너게 된다.
한편, 생사현실에서 <공>함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오히려 이를 통해 <잘못된 자세>를 취하기도 쉽다.
일체가 차별없이 <공>하다. 그리고 <무아ㆍ무자성>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 아무것이나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또는 어차피 다 공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또는 <생사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고 잘못 여기기 쉽다.
이는 <악취공견>의 입장이다.
이런 경우 <공>함을 제시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공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생사현실>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또 <공의 이해>만으로 <생사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생래적으로 일으킨 번뇌>가 모두 일시에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구생기번뇌]
<생사현실>에 임하는 한, 여전히 <감각>을 하게 되고, <추위 배고픔> 등을 느낀다.
그러나 <공>함을 이해하여 현실이 <실답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망집>을 제거한다.
그러면 잘못된.망상부별에 바탕한 업과 생사고통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행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평안히 참고 <극복>해 나간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런 가운데 <수행>을 원만히 성취해야 한다.
그러면 이에 바탕해 <생사현실>에서 <고통>을 극복해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생사현실> 안에서 <실재가 공함을 깨닫는 것>이 갖는 <기능>과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통해 일체가 <차별없이> <공>하여, 일체가 다 그대로 <무방한 것>으로 잘못 여긴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망집>을 유지하고 키워나간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매 경우 <업>을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로 인해 차별 없이 <공>한 가운데 하필 극심한 <생사고통>에 반복해 처하게 된다.
이런 자세의 문제점을 이미 살폈다.
(참고 ▣- 집착이 없으면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악취공견)
한편 <공>을 오로지 <아무 것도 전혀 없음>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곤란하다.
<공>함은 실재에 <전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모든 것이 아주 <똑같음>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처음 <공>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유무> <2분법상의 분별>에 매여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有]에 치우쳐 집착을 갖고 임한다.
그런 사정으로 방편상, 우선 <무>라고 표현하며 <유[有]에 치우친 집착>을 제거함에 치중한다.
그런데 <공>의 의미 자체를 잘못 이해하여 오로지 '<없음>'에 치우친다고 하자.
그리고 실재에 <아무 것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런 이해를 통해서도 일단 <유[有]에 치우친 번뇌와 생사고통>은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계>를 닦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복덕>은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후 올바른 <서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수행노력을 게을리 하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없음>에 치우친 견해를 갖지 않아야 한다.
실재의 공함은 <있고 없음>의 <양극단>을 모두 떠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사현실 안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바탕으로 올바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살이 <서원>을 일으켜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보시, 계율, 인욕, 정진, 정려, 반야> 등으로 수행을 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사현실에서 <무량한 복덕과 지혜>의 광명을 쌓는다.
그리고 생명을 <제도>한다.
그래서 <무량한 선>을 실천한다.
이로써 <부처>의 상태를 이룬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사현실>에 <차별>이 있게 된다.
즉, <일반 중생>과 <보살>과 <부처>는 각기 다른 차별이 있다.
경전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究竟涅槃]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위없이 올바른 깨달음[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느니라.
...
(『반야바라밀다심경』 K0020)
K0020V05P1035a12L;
...
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
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
[반복]
>>>
♥Table of Contents
▣● <수행목표>와 <염리, 희탐진>
<심해탈> 상태가 되어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상태 역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다.
따라서 다시 <염리 희탐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즉, <수행목표 상태>도 <현실 내용>처럼 역시 싫어하고 떠나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수행의 <근거>
<심해탈>에 이르러도 여전히 <무상ㆍ고ㆍ공ㆍ비아>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일반 현실>과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 수행을 통해 <심해탈>을 굳이 얻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수행>은 <일반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어야 이를 행할 필요성이 있다.
불교를 처음 대할 경우 이런 <여러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
[반복끝]
♥Table of Contents
▣- 수행에 대한 <집착> 제거 필요성
<열반>이나 <깨달음>(보리), 또는 <부처>의 상태는 <수행목표>다.
그러나 이 역시 <공>하다. 그리고 <무아ㆍ무자성>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번뇌>의 상태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행목표>도 역시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수행을 해나가야 한다.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지금껏 가진 <번뇌>와 <집착>을 제거한다.
그러나 반대로 <수행목표>나 <방안>에 대해 <집착>을 갖게 되기 쉽다.
<그런 경우> <집착>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를 갖게 된다.
<수행>은 이런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수행시 <수행목표>나 <수행>에 <집착>하기 쉽다.
그런 경우 <그런 집착>자체도 문제된다.
최종 <목표 상태>인 <부처>나 <열반>도 역시 <무아ㆍ무자성>이다.
<다른 일반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일체>에 대해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도 <번뇌>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또 그래야 <수행>>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열반에 대해 살핀다.
그런 경우 <수행>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무상한 현실>과 <고통의 윤회과정>을 올바로 관한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무상ㆍ고ㆍ공ㆍ비아>를 잘 이해한다.
그리고 <승의무자성ㆍ생무자성ㆍ상무자성> 등도 잘 이해한다.
이런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망상분별>을 제거한다.
그리고 망집번뇌에 바탕한 <업>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로써 <고통>의 현실을 벗어난다.
이들이 원래의 <청정 진여 니르바나>를 덮어 가리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한다.
그래서 원래의 <청정 진여 니르바나>를 드러낸다.
그리고 <번뇌- 업 - 고통의 관계>를 벗어난다.
그리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1차적 수행목표>가 된다.
이후 다음이 <제 2차적 수행 목표>가 된다.
즉,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망상, 분별, 번뇌,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생사 현실>내 어떤 고통에서도 <니르바나의 상태>로 <여여하게> 임한다.
한편 그런 상태에서 다음이 <제 3차적인 수행목표>가 된다.
<현실의 어떤 상태>에서도 평안히 임할 수 있게 된다 .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가치있 는, <선한 서원>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얻을 것이 없음[無所得]>을 <방편>으로 하여 추구해간다.
그리고 수행을 <정진>한다.
그래서 서원을 <성취>한다.
그리고 이를 <유지>해나간다.
그래서 이런 <수행목표>를 향해 올바로 수행해 나간다.
이런 수행방안은 이미 살폈다.
그러나 <수행의 실천>이 결국 현실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수행방안을 다시 짧게 요약해 살피고 마치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 기본적 <수행방안>
수행방안은 <계율>-<선정>-<지혜>[3학]을 닦아 나가는 것이 된다.
<재가 신자>가 닦는 계로 <5계>, <8관재계>가 있다.
그리고 정식 <출가수행자>가 행하는 <사미 사미니> <10계>(戒)가 있다.
그리고 <비구 비구니>의 <구족계>(250ㆍ348 具足戒)가 있다.
한편, <보살승 수행자>가 준수하는 <보살계>가 있다.
(참고 ▣- 기본적인 계의 덕목의 성취)
계율 가운데 <본성적인 계의 덕목>이 있다.[性戒]
살생(殺生)ㆍ도둑질[偸盜투도]ㆍ사음(邪婬)ㆍ거짓말[妄語망어]를 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계의 덕목>은 <업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고 제거한다.
그리고 <복덕>을 쌓게 한다.
한편 <일정한 대상>에 대해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일정한 주제>에 대해 자세하고 바르게 <관찰>한다.
이를 <정>(定)을 닦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삼매, 삼마제, 삼마지>라고도 한다.
<삼매>의 기본은 마음을 하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는 것이다.[心一境性심일경성]
이런 <삼매> 수행은 수행항목 전반에 걸쳐 중시된다.
(참고 ▣- 정(定: 삼매)
그리고 <고통>-<고통의 원인>-<고통을 멸한 상태>-<그 방안> 등 진리의 내용을 올바로 관한다. [苦集滅道고집멸도 四聖諦 4 성제]
그런 가운데 <37가지 수행방안>을 행한다. [菩提分法보리분법-깨달음의 일부를 이루는 법]
이런 내용이 <기본 수행방안>으로 제시된다.
(참고 ▣- 37 도품 )
이 <37도품>의 내용은 다음 구조로 되어 있다.
- <사실>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 [4념처]
- <목표>의 올바른 설정 [4의단]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4신족]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와 <능력> [5근ㆍ5 력]
- <지혜>를 얻기 위한 올바른 <방안> [7각분]
- 그리고 <생활> 전반을 올바로 살기 위한 <종합적 방안>[8정도]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즉, <몸>, <감수>, <마음>, <법>(나머지 모든 것과 관념)을 관한다.
[心심,受수,心심,法법]
그래서 <그 깨끗하지 못함> , <고통스러움>, <영원하지 않음>, <참된 진짜로서의 나의 실체가 없음> 등을 관한다.
이를 통해 생사현실에 대한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한다.
[不淨부정, 苦고, 無常무상, 無我무아 - 四念處4념처, 四念住4념주]
한편 <이미 있는> <악>은 더 키우지 않는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악>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선>을 행한다.
<이미 있는> <선>을 키운다.
[四正斷4정단, 四正勤4정근]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4가지 방편>을 갖춘다.
즉, <희망>,
<노력>,
<기억>,
<지혜>를 갖춘다.
[慾욕, / 精進정진,/ 念념 心심,/ 慧혜 思惟사유 / - 四如意足4여의족, 四神足4신족]
그리고 수행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기초>와 <능력>을 갖춘다.
즉, <믿음>, <노력>, <기억>, <선정>, <지혜> 등이다.
이를 통해 <망집번뇌>에 오염된 상태를 제거한다.
[信신, 進진, 念념, 定정, 慧혜 五根5근, 五力5력]
한편 <올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 다음 7가지 <수행방안>을 닦는다.
<기억>[념念]
<선택>[택법擇法]
<노력>[정진精進]
<기쁨>[희喜]
<몸과 마음의 경쾌함>[경안輕安- 또는 제除]
<집중>[정定]
<버림으로서 평정을 얻는 상태>[사捨]
등이다.
[念념, 擇法택법, 精進정진, 喜희, / 輕安경안 또는 除제, / 定정, 捨사 - 七覺支7각지, 七覺分7각분 ]
한편 <생활 전반>을 올바로 한다. [8정도八正道]
<자신과 세상의 정체>에 대해 올바로 관한다. (정견正見)
<의업>을 깨끗이 한다.
즉 <어리석음, 탐욕, 분노>에 바탕해 의업을 일으키지 않는다.(정사유正思惟)
<말>을 깨끗이 한다. [정어正語)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不妄語불망어]
그리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不兩舌불양설]
또 욕설 등의 <거친 말>을 하지 않는다. [不惡口불악구]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不綺語불기어]
그런 가운데 올바로 말한다.
그 다음 올바로 신업을 행한다. [정업正業]
즉,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다.
바르지 않은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올바로 행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갖지 않는다. [정명正命]
그런 가운데 <삶의 방편>을 올바로 취해 살아간다.
깨달음을 얻어 번뇌와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부지런히 수행>한다. [정정진正精進]
수행하고 배운 바를 올바로 <기억>한다. [정념正念]
올바로 <집중>하여 번뇌를 제거하고 사색하는 <삼매>에 든다. [정정正定]
그런 가운데 널리 제한 없이 온 생명을 대상으로 <좋음>을 베푼다.
즉 <선>(善)과 <지혜>(智慧), <행복>(幸福)과 <이익>을 베푼다.
그리고 <고통>과 <악>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한다.
또 다른 이들의 <악>, <어리석음, <고통>, <불행>, <손해>에 대하여 <함께 슬퍼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깨달음>과 <선>(善)을 성취함에 대하여 <함께 따라 기뻐한다>.
그 외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은 차별 없이 마음에서 <제거>한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과 <슬픔>, <기쁨>, <버림>의 마음을 일으킨다.
[자-비-희-사의 사무량심]
한편 <생사>를 곧 <니르바나>로 관한다.
그리고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을 제도한다.
그리고 <성불>함을 목표로 수행을 행한다.
이런 <보살 수행자>의 수행방안은 크게 통상 <10 바라밀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 생명들은 <망상분별>과 <집착>을 바탕으로 <업>을 행해간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런 방식으로 <업>을 행하는 것을 <중지>한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해 나아간다.
<일반적인 생명의 행위 반응 방식>과 <보살의 수행방안>을 놓고 비교해 보자.
일반적으로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일정한 내용>을 얻는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취해 <자신>이라고 잘못 여긴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외부세상>으로 잘못 여긴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1. <자신의 좋음>을 <집착>해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좋음>을 <아낀다>.
그리고 <좋음>을 필요한 다른 생명에게 <베풀지 않는다>.
2. 그리고 <자신의 좋음>을 추구한다.
그리고 <다른 생명이 집착하는 좋음>(생명, 신체, 재산, 가족, 지위, 명예...)을 함부로 <침해>한다.
그리고 다른 생명에게 <나쁨>을 가하게 된다.
3. 한편 <자신>이 <다른 생명>으로부터 <침해>받는다.
그래서 <자신이 집착하는 좋음>이 <침해>된다.
그래서 <나쁨>을 받는다.
그런 경우 평안히 <참지 못한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갖는다.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해>를 가하며 <보복>을 가한다.
<각 생명>이 이렇게 반응한다.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이들 <생명>이 서로 부딪힌다.
그러면 서로의 1-2-3 의 반응이 얽힌다.
그래서 서로 <가해>와 <피해> 관계가 쌓여가게 된다.
그래서 <고통>을 증가시키고 확대시킨다.
예를 들어 <모기>는 자신의 좋음을 위해 <사람>의 피를 빤다.
그러면 <사람>은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모기>를 잡아 죽인다.
이와 같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모기>에게 나쁨이다.
<모기>에게 좋은 것은 <사람>에게 나쁨이다.
경기에서 어떤 <한 쪽>이 통쾌하게 승리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게는 억울한 패배가 된다.
이런 관계와 같다.
1-2-3 의 한 장면만 놓고 살핀다.
그런 경우 이들 관계는 그런 행위로 한쪽에게 <좋음>을 가져다주는 것 같다.
그러나 <각 생명이 행하는 행위>는 이후 계속 그런 형태로 얽히어 반복된다.
마치 사물의 <작용-반작용의 관계>와 비슷하다.
즉, <한쪽의 1-2-3 의 반응>은 <다른 한쪽의 1-2-3 의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그렇게 행하게 되는 1-2-3의 반응은 다시 <다른 쪽의 1-2-3 의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1- 2-3 의 반응이 서로 오간다.
이런 경우 서로 <생사고통>을 심하게 받아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이 그것을 중지한다.
그리고 각 경우 <그 반대방향>으로 행한다.
그런 가운데, 모든 이가 다 함께 그런 형태로 행해가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방안>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어느 한쪽>이 1-2-3의 반응을 중지한다.
그리고 <그 반대방향>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 한 쪽>만은 일단 <고통>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먼저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망집이 각 경우 1-2-3의 반응을 행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보살의 <수행 내용>은 이런 내용을 출발점으로 한다.
보살 수행자는 <자신>과 <자신의 것>에 대한 <망상분별>과 <집착>을 제거한다.
그런 바탕에서 <중생제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온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들에게 <좋음>을 아낌없이 베푼다.
즉, <재산>이나 <진리>를 베푼다.
그리고 다른 이로부터 <두려움>을 없애 준다.
이처럼 <좋음>을 <아낌없이 베푼다>. [보시(布施)]
2. 한편 다른 생명들은 일정한 <좋음>을 집착한다. [생명, 신체, 재산, 가족,...]
이런 내용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른 <계율>을 지킨다. [정계(淨戒)-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3. 한편 <다른 생명>이 <자신>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에 대해 <망상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상(相)>을 취하지 않는다.
즉 <저 부분>은 철수다.
<이 부분>은 자신이다.
지금 <철수>가 <자신>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처럼 <상(相)>을 취해 임하는 것이 잘못된 <망상분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에 임해 <평안히 참는다.
한편, 현실에서 <분별>을 일으킬 경우에도 되도록 좋게 해석한다.
모든 중생이 과거생의 자신의 <부모>였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또 이 모든 중생이 <장차 성불할 위대한 존재>다.
따라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또 이들은 한편 상대는 현재 <망집>에 바탕해 행한다.
그리고 <생사고통>을 받아간다.
따라서 이런 점을 안타깝게 <연민의 마음>으로 대한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이를 도와줘야 할 상태다.
이 경우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를 대하듯 상대를 관한다.
또는 <현명한 부모>가 <철부지 아이>를 대하듯 상대를 관한다.
그래서 상대가 함부로 임해도 이를 <평안히 참는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안인(安忍)]
그런 가운데 온 생명을 모두 다 함께 <최상의 상태>로 이끌려는 마음을 갖는다.
4. 그리고 <없는 선>은 새로 만든다.
<있는 선>은 키운다.
<없는 악>은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
<있는 악>은 키우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 나열한 <보시>와 <계율>, <인욕>의 행을 꾸준히 정진해 나간다. [정진]
이런 수행으로 보살은 <복덕>을 쌓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덕자량>을 바탕으로 다시 <지혜자량>을 쌓아가게 된다.
5. 한편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번뇌>를 마음에서 <제거>한다.
그리고 집중된 마음으로 <각 주제>를 깊이 <사색>하며 관한다. [정려(靜慮)]
6. 현실을 본바탕인 <실재 진여>와 관련시켜 관한다.
그래서 <실상>을 꿰뚫어 관한다.
그래서 <분별>을 떠나 <무분별의 깊은 지혜>를 닦아 나간다. [반야]
이를 통해 <지혜의 장애>[소지장]을 제거해간다.
그리고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7. 그리고 <중생제도>와 <성불>의 <서원>을 실천해 간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지가지 <수단>과 <방편>을 찾고 마련한다. [방편(方便)]
8. 자신도 <번뇌>를 벗어나 머무른다.
다른 생명들도 모두 <번뇌>를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자신도 <깨달음>을 얻어 머무른다.
그리고 다른 생명들도 모두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게 한다.
또 <그 다른 생명>들도 <또 다른 생명들>을 대상으로 그처럼 행해갈 수 있도록 이끈다.
이런 서원을 실천해간다. [원(願)]
9.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선>을 실천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힘>을 갖는다. [력(力)]
10. 현실에서 각 내용의 <정체>와 <인과>에 대해 <분별 지혜>를 얻는다. [지(智)]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사 현실> 안에서 서원을 <실천>하며 수행을 <정진>해간다.
이상과 같은 <10 가지 내용>이 보살이 행하는 수행이다.
즉 보시-정계-안인-정진-정려-반야-방편-원-력-지바라밀다가 10 바라밀다행이다.
(참고 ▣- 보살수행과 바라밀다)
보살은 이런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법신>을 증득하고 <성불>한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보살 수행자>의 <구극적 목표점>이 된다.
<복덕>과 <지혜> 자량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시ㆍ정계ㆍ안인> 3가지는 <복덕>의 자량을 쌓게 한다.
<반야>는 <지혜>의 자량을 쌓게 한다.
<정진>과 <정려> 두 가지는 <복덕>과 <지혜> 자량 모두를 쌓게 한다.
<보시ㆍ정계ㆍ안인> 3가지는 생명을 넉넉하고 이롭게 한다.
<정진ㆍ정려ㆍ반야> 3가지는 일체 번뇌를 물리친다.
6바라밀다의 <수행 차례>는 다음과 같다.
몸과 재물에 대하여 <아낌이 없다>.
그러면 곧 <청정한 계>(戒)를 받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계를 지키기 위해 <안인>을 닦는다.
안인을 닦고 <정진>을 낸다.
정진을 닦고 <정려>를 성취한다.
정려를 갖추고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해심밀경』 제4권 7. 지바라밀다품地波羅蜜多品 }
♥Table of Contents
▣○ <경전>의 <불설 비불설> 논의
<경전>에는 여러 판본이 있다.
『잡아함경』의 경우를 놓고 보자.
이런 경우 <다양한 판본>을 볼 수 있다.
<한문>판본, <한글>번역본, <팔리>어 판본과 <영어> 판본 등이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이 더 원<형>에 가까운 것인가 의문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경전이 과연 <원형의 경전>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이는 자신이 대하는 경전에 어느 정도 <신뢰>를 둘 것인가 하는 의문과도 같다.
그런 <의문>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경우 경전에 대해 <신뢰>를 두기 어렵다.
그리고 <실천>을 하기도 힘들게 된다.
♥Table of Contents
▣- 경전 <전파 경로>와 <원본> 문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북인도에서 설법을 처음 하셨다.
그런데 그 설법 <원형>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전파되어 <기록된 판본>들만 남아 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하는 <여러 경전>들이다.
우선 <팔리어>경전이 <스리랑카>에 남아 있다.
그리고 <한문> 번역경전이 <중국>에 남아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와 <중국>의 위치관계를 살펴보자.

○08pfl--image\경전의전파경로.jpg
<팔리어> 경전은 <남방 불교>의 원전으로 취급된다.
<스리랑카>도 포함된다.
그러나 팔리어 자체가 스리랑카의 언어는 아니다.
<팔리어>는 소승불교경전의 언어다.
불타의 가르침을 담은 성전의 게송[偈] 및 산문, 그리고 그 주석 등이
이들 팔리어로 남아있다
이는 중기 인도 아리아어, 프라크리트어를 대표하는 언어다.
그 역사는 오래되었다.
본래 인도의 어느 곳의 방언이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논의되고 있다.
언어적으로 보면 중부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의 서부의 방언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다만 팔리어는 아소카왕 비문 중 서부의 길나르의 언어와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오래된 전설에서는 마가다어라고 한다.【1】
불교 문헌은 처음 마가다 지방의 동부 방언에서 팔리어로 번역된 것으로 추정한다.
가령 팔리어의 a어간의 남성 단수주격은 -o, 중성은 -am이다.
이에 대해서, 마가다어는 -e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다어적인 요소가 지적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1】
그 흔적이 때로 팔리어에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팔리어 경전과 한역 경전 등에서 어느 것이 <원형의 경전>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지리적 위치>로 보나, 그 <언어적 계통>으로 보나, 그것만으로는 불확실하다.
【주석】---
【1】『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주석】---
♥Table of Contents
▣- 분량의 장단과 원본 문제
A라는 <원형>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원형>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퍼져 나갔다고 가정하자.
그런 경우 어느 곳에서 발견되는 경전도 같은 A만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남아 있는 <여러 경전>들은 그렇지 않다.
그 <체계>나 <형태>가 서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A라는 <원형>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 빠진 것>이 B라고 하자.
또 <무언가가 더해진 것>이 C라고 하자.
이 때 빠진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더해진 것이 잘못인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자신이 대하는 경전이 <원본>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진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빠진 것도 잘못이다.
그러니 다른 쪽 경전이 <원본>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또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잘못이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진 것도 잘못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경전들 사이에는 어느정도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것은 다른 것에 비해 더해진 내용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빠진 내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어느 판본도 원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심지어 여러 판본가운데 공통된 부분도 그 내용을 원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처음 어느 단계에서 잘못된 판본이 이후 여러 판본에 함께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셨다.
이후 경전이 전해지기까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졌다.
팔리어 경전이거나, 산스크리트 경전이거나, 또는 한역 경전이거나 사정이 엇비슷하다.
여하튼 오늘날 각지에 다른 형태로 경전이 남아 있다.
그러나 남겨진 경전만으로는 그 변형 과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추리에 의하여 주장되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어느 것이 원본인가에 대해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소승경전 대승경전에 관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
근대 문헌학자들은 다음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대승경전은 후기 불교 신자들이 창작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추리의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
스리랑카에 대승경전들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당시 대승경전이 인도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스리랑카에 처음 근본 경전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후 다시 대승 경전이 들어간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뿐이다.
여러 판본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원본인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놓고 생각해보자.
삼국지는 220~280년대의 중국의 역사다.
정사로서 삼국지는 진수(陳壽)가 285년대 편찬한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이를 원나라시대 나관중이 소설화한다.
나관중은 대략 1364년경 생존한 인물이다.
이는 3국시대로부터는 1000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소설 삼국지의 기원으로 알려진다.
그래도 여하튼 소설 삼국지의 원형은 나관중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삼국지는 오늘날 한국에도 여러 판본이 있다.
때로는 초등학생용으로 짧게 줄인 판본도 있다.
그리고 만화로 그린 것도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모든 문명의 기초가 없어졌다고 하자.
예를 들어 세계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단지 남아 있는 여러 판본을 대한다.
그런 경우 이들 판본만 놓고 원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이 가운데에서 어떤이는 단지 분량이 짧은 것이 원본이라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긴 분량의 삼국지는 짧은 것을 늘려 만들어 낸 위본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것을 가상설이라고 한다.
또 그 반대는 반대로 주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긴 분량의 삼국지를 원본이라고 여긴다고 하자.
그런 경우 짧은 것은 이것을 축약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진본이 아니라고 여기게 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입장이 옳은가.
그런데 두 방향으로의 변형이 현실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한편 이런 경우 정사 삼국지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가.
또 나관중이 처음 쓴 삼국지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가.
이런 사례는 하나의 소설가를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다.
소설가가 소설을 쓴다.
이 경우 소설가가 마음에서 미리 구상하기도 한다.
그래서 짧은 골격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 골격에 내용을 붙여 길게 늘여 쓰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 경우도 있다.
인생의 가지가지 경험을 그 때 그 때 산만하게 기록한다.
그 다음 나중에 이것을 묶어서 짧게 줄인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다.
♥Table of Contents
▣- 다양한 설법 방식과 원본 문제
어떤 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일 수 있다.
그는 늘 주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행위를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 주제로 <초등학생>을 만났을 때는 어떠어떠하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중학생>을 만났을 때는 다시 이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
또 <학자>들을 상대로 한 논문에서는 또 이와 다른 형태로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매번 다른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사람도 <갓난아이>를 대할 때는 그저 갓난아이를 달래는 일만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게 된다.
현재 남아 있는 경전의 상황도 비슷하다.
각 판본 사이에서 그 선후나 원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 <형태>나 <내용>, <분량>, <표현> 등만으로 단순히 이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그런데 그 선후나 원본 여부를 이런 방식으로 추리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는 무모한 추리가 된다.
본인은 작은 논문을 약 1년여에 걸쳐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
처음 논문 작성시 쓰고자 한 논문의 골격이 있었다.
그런데 최종 완성본을 제출한 시기까지 매일 매일 내용과 형태가 바뀌어져갔다.
어제 본 내용을 오늘 검토한다.
그러면 수정할 부분이 발견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다.
그리고 계속 그런 형태로 이어진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고를 제출할 시한이 정해져 있다.
또 분량에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제출시점이 되어서는 분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표현할 방안을 찾게 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압축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 완성본을 제출하게 된다.
그 이후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
그러면 역시 조금 더 수정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내용을 보충할 부분도 발견한다.
지금 <여기에 올려진 글>들도 마찬가지다.
처음 글을 올린 후 읽을 때마다 조금씩 내용을 변경하고 바꾸어 왔다.
사정이 이와 같다.
그런데 이 과정의 원고들을 다 나열해 놓는다고 하자.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원본인가를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글쓴이 자신도 답하기 곤란하게 된다.
한 사람이 원고를 쓸 때도 사정이 이와 같다.
그런데 경전에서도 그 사정이 유사하다.
♥Table of Contents
▣- 다양한 전파 번역 과정과 원본 문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상대에 맞추어 각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한다.
그 후 그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
그리고 정리된다.
이런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친다.
번역의 경우에서는 그 변화가 훨씬 심하다.
이런 사정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문 경전을 놓고 10사람에게 번역을 맡긴다고 하자.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번역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차이는 중국의 번역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한 의미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승 경전 불설 비불설>에 관한 논의로 미룬다.
♥Table of Contents
▣- 깨달음을 주는 소재로서 경전의 가치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은 <판본 연구>가 주목적은 아니다.
그 보다는 경전이 <실질적으로 주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진리나 가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입장에서 경전을 대하는 것이 낫다.
경전의 내용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믿는다.
그리고 되도록 외어 암송하고 지니려 노력한다.
이런 자세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요구된다.
부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라는 가르침을 주신다.
그런 입장에서 경전을 대한다.
그런 경우 어느 경전을 대하던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는 다음처럼 생각하게 된다.
경전뿐만 아니라, 모든 색상문자가 <진리와 가치>를 담고 있다.
그리고 모두 자신에게 진리와 가치의 깨달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다.
♥Table of Contents
▣- 마침
현재 판본 [v2569-033]
###
-부기-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중간중간 수정작업시마다 각 사이트별 사정상 일치화 작업을 함께 행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게시 이후 작업 수정 및 보충은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폴더 및 blogspot 사이트 페이지에서만 반영하기로 합니다.
● 기초아함경 연구 편집장소
https://drive.google.com
● 불교개설서 연구 편집장소
https://drive.google.com
● 블로그 페이지 blogspot 사이트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
만일 중간 업데이트된 내용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는
위 구글드라이브 또는 블로그 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일치화가 마쳐지면 본 안내는 제거됩니다.
판본수정 정리 내역은 별도 zip파일안에 첨부합니다.
txt 파일간의 수정내역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토탈커맨더에서 <메뉴-파일-내용으로 파일비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voth4287
| ◈Lab value 불기2554/11/25 |
 ○ 2018_1022_141717_nik_ori.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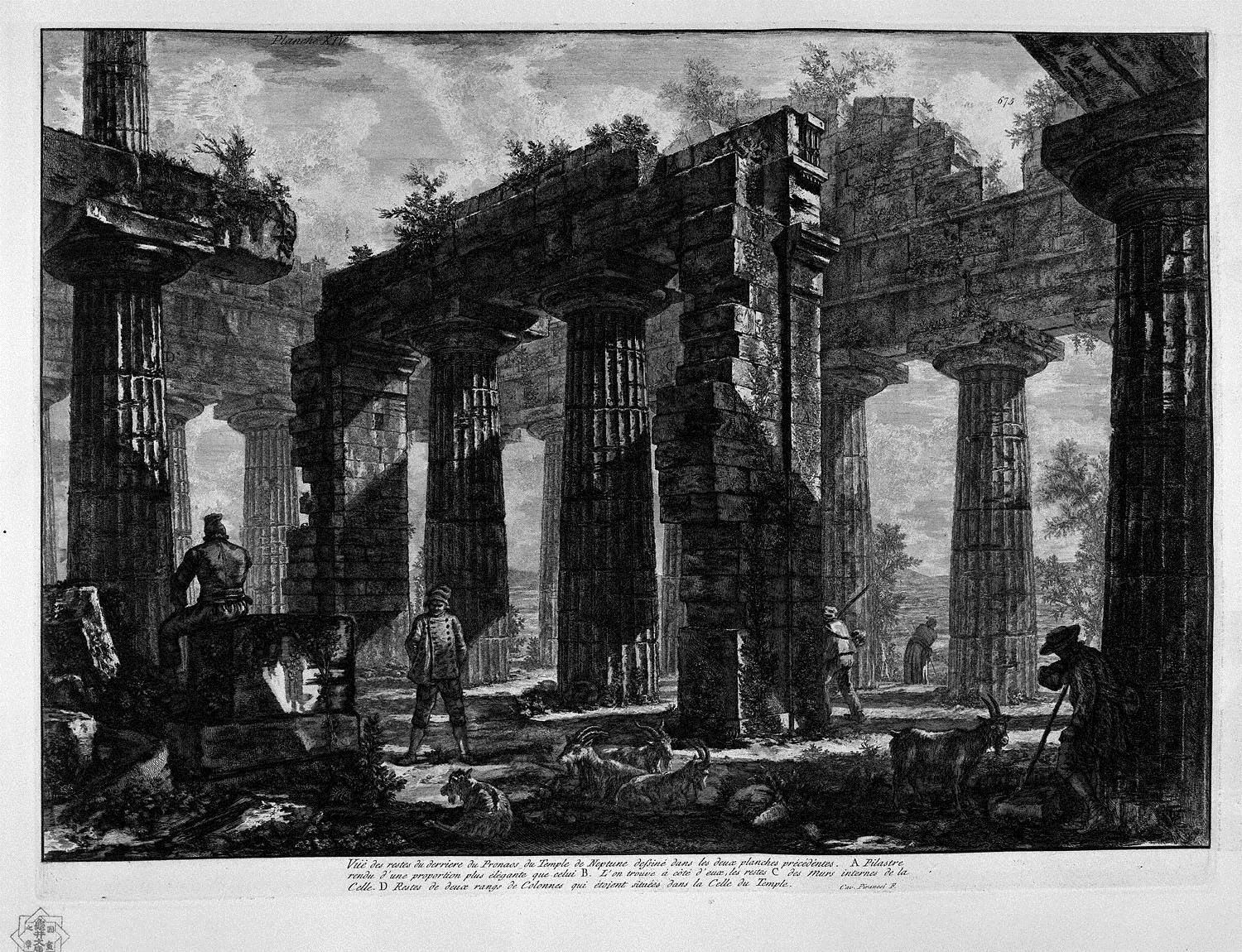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Giovanni-Battista-Piranesi-leftovers-behind-the-pronaos-of-which-the-above-table [#M_▶더보기|◀접기| Artist: Giovanni-Battista-Piranesi from https://en.wikipedia.org/wiki/Giovanni_Battista_Piranesi Title : leftovers-behind-the-pronaos-of-which-the-above-table Info Permission & Licensing : Wikiart ● [pt op tr] fr _M#]  ○ 2018_0418_121937_can.jpg ○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Gurilandrib [#M_▶더보기|◀접기| 日本語: 最近は十和田湖にてRIBの機動性を生かした観光ツアーも人気 作者 佐藤ぐりら Permission & Licensing : Wikipedia ● [pt op tr] fr _M#] ♥Mansilla de la Sierra ,Spain ○ 아름다운 풍경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ith the image 'Google Earth & Map data: Google, DigitalGlobe' ○상세정보=> https://buddhism007.tistory.com/5833 Michel Berger - Bats-Toi ♥단상♥ |
|
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4287 sfed--잡아함경_K0650_T0099.txt ☞제1권 sfd8--불교단상_2554_11.txt ☞◆voth4287 불기2554-11-25 θθ |
■ 선물 퀴즈
방문자선물 안내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 페이지 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범】Tiryagyoni 저율차(底栗車)라 음역. 방생(傍生)ㆍ횡생(橫生)이라고도 번역. 남이 길러주는 생류(生類)라는 뜻. 고통이 많고 즐거움이 적고 성질이 무지하여 식욕과 음욕만이 강하고, 부자 형제의 차별이 없이 서로 잡아먹고 싸우는 새ㆍ짐승ㆍ벌레ㆍ고기 따위. 그 종류는 매우 많아서 『십이유경(十二遊經)』에는 6400의 물고기와 4500종의 새, 2400종의 짐승이 있다고 함. 사는 곳도 물ㆍ하늘ㆍ뭍에 걸쳐 있음. 중생으로서 악업을 짓고 매우 어리석은 이는 죽어서 축생도에 태어난다 함.
답 후보
● 축생(畜生)
취(取)
치류(緇流)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
칠종(七宗)
타력(他力)
타승죄(他勝罪)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M_▶더보기|◀접기|
■ 음악
Barbara - Mes Theatres
Les Chats Sauvages - Est-Ce Que Tu Le Sais
Serge Lama - La Fille Dans L'eglise
Amelie Les Crayons - Tout De Nous
Marie-Paule Belle - Debranche Ton Soleil
Georges Moustaki - Ce Soir Mon Amour
Michel Berger - La Fille Des Annees 2000
■ 시사, 퀴즈, 유머
뉴스
퀴즈
퀴즈2
유머
■ 한자 파자 넌센스 퀴즈
【 】 ⇄✙➠
일본어글자-발음
중국어글자-발음
■ 영어단어 넌센스퀴즈- 예문 자신상황에 맞게 바꿔 짧은글짓기
■ 번역퀴즈
번역
■ 영-중-일-범-팔-불어 관련-퀴즈
[wiki-bud] Sangha
[san-chn] vi-√muc 令得解脫, 滅除, 背捨, 證得解脫
[san-eng] saumyavapuḥ $ 범어 the beautiful form
[pali-chn] arahat 應供
[pal-eng] sugopita $ 팔리어 pp.well guarded or protected.
[Eng-Ch-Eng] 北郁單越 【參照: 北俱盧洲】
[Muller-jpn-Eng] 華嚴探玄記 ケゴンタンゲンキ Record of the Search for the Profundities of the Huayan Sutra
[Glossary_of_Buddhism-Eng] UNSOLICITED FRIEND☞
See also: Good Spiritual Advisors.
In the Avatamsaka Sutra, this term refers to Bodhisattvas who
act as friends and benefactors, unbeknownst and unsolicited, to all
sentient beings. As the Avatamsaka Sutra (Ch. 21) states:
“The Bodhisattvas also conceive this overwhelming determination:
‘If I attain complete perfect enlightenment first without having established all sentient beings on the path of unsurpassed liberation, I
would be violating my original vow – that would never do; so I should
first cause all sentient beings to attain Supreme Enlightenment and
Nirvana Without Remainder and then after that fulfill Buddhahood.
Why? Sentient beings have not asked me to set my mind on Enlightenment. I, of my own accord, act as an unsolicited friend to sentient beings,
wishing to first cause all beings to fully develop their good potential and
obtain omniscience.’ ”
[fra-eng] davantage $ 불어 more
■ 암산퀴즈
614* 95
529419 / 789
■ 다라니퀴즈
자비주 17 번째는?
성관자재보살 명호 5 번째는?
17
○ 이렇게 원을 발한 다음
지극한 마음으로 제 이름(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며[稱念]
다시 저의 스승 아미타불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한[專念] 후에
○ 이 다라니 신주를 외우되
하룻 밤 동안
3*7 (21) 편이나
7*7 (49) 편씩 외우면
몸 가운데 있는 백천만억겁토록
나고 죽으며 지은 큰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주]------
* 이 부분에서
계족도(戒足道)를
계정도(戒定道)로 보기도 한다.
● 마바특두 摩罰特豆<十七> ma va du du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
5
바리가사 나바바삼유아나
波哩訖叉<二合>拏婆嚩三喩惹曩<五>
『성관자재보살일백팔명경』
♣1122-001♧
■ 삼매_게송퀴즈
■ 오늘의 게송
[329일째]
성취제인불가설 $ 071▲偈羅偈羅為 一 ● 窣步羅, ○□□□□,無,具,住,起
□□□□□□□, 無生法忍不可說,
具足寂靜不可說, 住寂靜地不可說,
□□□□□□□, 무생법인불가설,
구족적정불가설, 주적정지불가설,
참는 일 성취함을 말할 수 없고
죽살이 없는 지혜 말할 수 없고
고요함을 갖춘 일 말할 수 없고
고요한 데 머무는 일 말할 수 없고
[78째]
피제법지불가설 $ 078▲娑攞荼娑攞荼為 一 ● 謎魯陀, ○□□□□,彼,彼,彼,彼
□□□□□□□, 彼淨法輪不可說,
彼大法雲不可說, 彼大法雨不可說,
□□□□□□□, 피정법륜불가설,
피대법운불가설, 피대법우불가설,
저 여러 법의 지혜 말할 수 없고
깨끗한 법 바퀴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큰 법 구름을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큰 법 비도 말할 수 없고
●K0960_T1552.txt★ ∴≪A잡아비담심론≫_≪K0960≫_≪T1552≫
●K0650_T0099.txt★ ∴≪A잡아함경≫_≪K0650≫_≪T0099≫
●K0745_T0101.txt★ ∴≪A잡아함경≫_≪K0745≫_≪T0101≫
법수_암기방안
71 라선[腡선] = 손금선 /또는 갈고리뼈 (=헤이메이트 HAMATE~갈고리뼈]
78 *무지 (~ 엄지)
17 알통 [바이셉쓰biceps ]
5 목 ●
58330
671

○ 2019_1104_121746_can_exc_s12 구례 화엄사

○ 2020_1114_141647_can_ori 삼각산 도선사

○ 2018_1022_164457_can_exc 공주 태화산 마곡사

○ 2018_1022_132312_can_ori 공주 계룡산 갑사

○ 2020_1017_160314_can_exc 삼각산 화계사

○ 2020_0930_145351_can_ori_rs 화성 용주사

○ 2020_0910_182826_can_ori_rs 월악산 신륵사

○ 2019_1105_133624_can_exc 순천 조계산 선암사

○ 2019_1106_154420_can_fix 화순 계당산 쌍봉사

○ 2019_1106_105047_nik_exc 화순 영구산 운주사

○ 2019_0106_162326_nik_exc 의정부 도봉산 망월사

○ 2018_1023_155702_nik_ori 예산 덕숭산 수덕사

○ 2018_1024_174207_nik_ori 부여 고란사

○ 2020_0430_125216_can_exc 종로구 창의문로 성불사

○ 2019_1106_130433_can_exc_s12 화순 영구산 운주사

○ 2020_0907_152418_can_ori_rs 양산 통도사
● [pt op tr] fr
_M#]

○ 2020_0904_130729_can_ori_rs 원주 구룡사
[오래된 조각글재정리 안내]
☎잡담☎ = 순전한 잡담부분
● = 논의부분
재검토시작 Lab value 2565/03/19/금/17:34
♥본 페이지는 현재 작성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문단, 표현 재정리 작업중
경전정리 (▽정리중) (▼마침)
논의 (○정리중) (●마침)
조각글 (☆정리중) (★마침)
™善現智福 키워드 연결 페이지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06/keyword.html
○ [pt op tr]
● 잡아함경_K0650_T0099 [문서정보]- 경전논의 키워드
[#M_▶더보기|◀접기|
『잡아함경』 ♣0650-001♧
[관련키워드]
제1권
■ 본 페이지 ID 정보
잡아함경_K0650-T0099-001-01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3/k0650-t0099-001-01.html
sfed--잡아함경_K0650_T0099.txt ☞제1권
sfd8--불교단상_2554_11.txt ☞◆voth4287
불기2554-11-25
https://blog.naver.com/thebest007/222280859486
사이트 사정상 전체 분량 업데이트 중지
https://buddhism007.tistory.com/228
다음 네이버 연결용 임시 페이지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5/02/k0650-t0099-001-01.html
사이트 사정상 중지 http://buddhism.egloos.com/6944111
사이트 사정상 업데이트 중지 https://reality007.tistory.com/17
사이트 사정상 업데이트 중지 https://thebest007.tistory.com/627
사이트 사정상 업데이트 중지 https://blog.daum.net/thebest007/627
htmback--잡아함경_K0650_T0099_불기2554-11-25-tis.htm
● [pt op tr] fr
_M#]
댓글 없음:
댓글 쓰기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Do you know why this is the most important?